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90
[유라시아 견문] 유라시아의 길
지금 '한미 동맹'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2015년 새 연재 '유라시아 견문'이 3월 10일 닻을 올립니다. 그 동안 '동아시아를 묻다'를 통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시각을 보여줬던 유라시아 연구자 이병한 박사(연세대학교 동양사학과)가 앞으로 3년 일정으로 유라시아 곳곳을 직접 누비며 세계사 격변의 현장을 독자에게 전합니다. '유라시아 견문'은 매주 화요일, 독자를 찾아갑니다.
동아시아
지난 1년 호떠이에서 살았다. 하노이(河內)는 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물의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수가 호떠이다. 덕분에 아침은 근사했다. 물안개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 일품이었다. 산책하며 자문했다. 어쩌다 이곳까지 왔나. 답은 자명했다. 동아시아였다. 동아시아론에 감화되어 베트남까지 이른 것이다.
호떠이(Ho Tay)는 호서(湖西)이다. 우리식으로는 서호(西湖)이다. 비단 하노이의 서편에 자리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서호는 그 자체로 역사적, 문학적 은유이다. 중국의 항저우(杭州)에는 바다와 같은 서호가 자리한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만큼 커다란 호수이다. 시심(詩心)을 절로 일으키는 강남 문화의 처소이다. 수원성 근방에 서호가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학자 군주 정조의 정신세계에도 서호가 있었다. 동아시아의 공통 유산인 것이다.
과연 호떠이를 걷노라면 중화 세계의 흔적이 역력하다. 최고 명문 고등학교의 이름은 베트남 최초의 유학자 쭈반안(Chu Van An)에서 따왔다. '베트남의 정도전'에 빗댈 수 있는 레 왕조의 개국공신 응우옌짜이(Nguyen Trai)가 석양을 바라보며 시를 썼다는 자리도 기리고 있다. 천년사(千年寺)를 비롯한 사원과 서원도 여럿이다. 천년 고도의 기품을 찬찬히 음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베트남은 중화 세계의 가장자리이면서 동북아와 동남아가 만나고 갈리는 곳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럽이 부쩍 가까웠다. 조선이나 대만(타이완)과 달리 제국 일본의 영향이 미미했다. 'Hanoi'라는 명칭부터가 프랑스 통치의 산물이다. 본래는 탕롱(昇龍)이었다. 용이 날아오르는 곳이었다. 그 상징성을 지워버렸다. 지리적 특징을 딴 범범한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한자가 사라지고 알파벳을 '국어(Quoc Ngu)'로 사용하게 된 기원도 프랑스에 있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오페라 극장은 파리풍이 여실하다. 오늘의 국가도서관은 100년 전 인도차이나대학이었다.
그런데 西歐(서구)만도 아니었다. 東歐(동구)도 멀지 않았다. 당장 내가 살던 집의 지척에는 러시아어, 즉, 키릴 문자로 간판을 새긴 작은 호텔이 있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되던 해 문을 열었다. 이웃한 우크라이나 식당의 흑맥주 맛도 손색이 없었다. 주인장은 1980년대 공업 기술을 전수하러 파견 나온 사람이었다. 하노이 처녀와 정분이 나서 눌러앉은 것이다.
시청은 모스크바 풍이었으며, 레닌 공원의 동상도 철거되지 않았다. 그만큼 베트남은 러시아와 동유럽은 물론 오늘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깊게 교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노이는 東方(동방) 천년과 동서구 백년의 유산이 어울린 독특한 풍경을 빚어내고 있었다. 혼종적이고 잡종적인 코스모폴리탄 도시였다.
나는 이곳에서 (북)베트남과 북조선의 연결망을 복원하는 작업을 했더랬다. 허나 문헌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쉬운 대로 김일성 종합대학 등 여러 곳에서 유학했던 분들의 말씀을 청해 들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너희들은 타국에서 배우고 익혀 조국의 전후 건설을 준비하라는 호치민의 뜻을 따랐던 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평양의 대동강에서 몽골 유학생과 중소 논쟁을 주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다짐까지 벌였다는 일화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퍼뜩 떠오른 것은 연암의 <열하일기>였다. 아하, 필담으로 향유했던 중화 세계의 문예 공화국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로구나. 커녕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었다.
냉전기 저들은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유학하며 중국말로, 조선말로, 몽골말로, 월남말로 소통하고 있었다. '죽의 장막'에 갇혀 있던 쪽은 이편이었지 저편이 아니었다. 저편은 중화 세계 너머 제3세계까지 활짝 열려 있었다. 더 중요하게는 新/舊(신/구)의 단절이 아니라 古/今(고/금)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름 아래, 혹은 비동맹 운동이라는 깃발 아래 좁게는 중화 세계의 연결망이, 더 넓게는 유라시아적 교류망이 재건되고 있었다. 멀리는 혜초가, 가깝게는 연암이 밟았던 길이 더욱 넓어지고 촘촘해졌던 것이다. 그래야만 북조선 문단의 일인자, 한설야의 이름을 딴 대로가 타슈켄트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고로 탈냉전 또한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만 치부하고 마는 것은 모자람이 크다. 냉전 이후의 실상이란 동서 냉전에 저항했던 운동, 탈냉전 운동의 확대와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의 재결합과 재통합이 더욱 확산되고 깊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귀환' 또한 '유라시아의 귀환'의 일부였다.
아니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던 발상 자체가 한반도의 남쪽에 묶여 있던 냉전기와 그 세대의 경험적 한계의 소산이다. 과연 한국에서 동아시아론이 발진하고 있을 때, 탈북자들은 중국을 지나 동남아와 동유럽으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었다. 냉전기에 다져진 유라시아의 길이 탈북한 조선인들의 생명선이 되어주었다.
대아시아
동아시아만으로는 족하지 못하다는 발상이 유별난 것은 아니지 싶다. 작년 말, 일본에서는 <몽, 대아시아(夢, 大アジア)>라는 신생 잡지가 창간되었다. 일본과 아시아를 재차 고민하는 듯하여 반갑기 그지없었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조락하고,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전후 체제 탈각 작업을 착잡하게 지켜보던 와중이었다. 민간의 대안적 지역 구상에 솔깃했던 것이다.
출범 장소부터 흥미로웠다.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이다. 규슈의 날씨는 열도보다 반도에 더 가깝다. 대마도를 지나 해류를 타면 한걸음에 닫는다. 그만큼 아시아의 바닷길과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었다. 반면으로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이기도 했다. 대륙 침략의 전진 기지 노릇을 했다.
불행히도 이들은 후자를 잇고 있었다. 현양사(玄洋社)의 후예를 자처했다. 올해는 마침 을미년이다. 을미사변 120주년이다.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이 현양사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공사였던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또한 현양사 출신이었다. 일순 기대가 꺾이고 불안이 엄습했다. 과연 민권보다는 국권, 국권보다는 천황을 중시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었다. 아베 정권을 능가하는 민간 우익이었다.
그들은 재차 아시아의 독립과 해방을 주창했다. 후쿠오카가 아시아 독립 운동의 거점 도시였음을 환기시켰다. 순 거짓말은 아니다. 쑨원(孫文)과 신해혁명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본심은 달리 있었다. 대청제국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분리 독립한 지방성들을 제국 일본의 품으로 끌어들일 작정이었다. 조공국들 또한 그런 식으로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하여 '獨立(독립)'이라는 화두가 다시금 불온하다. 중화 세계를 해체하고 제국 일본을 관철시켰던 선도적인 구호가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강요된 홀로서기는 自立(자립)과 自主(자주), 自治(자치)를 허용치 않았다. 자칭 '국제회의'에 불러들인 이들의 면모에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왕년의 조선, 대만, 만주를 대신하여 이제는 티베트, 내몽골, 위구르, 미얀마(버마), 태국(타이)에 공을 들였다. 명명도 불손하다. 내몽골은 남몽골로, 위구르는 동투르키스탄으로 고쳐 불렀다. 이쯤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화와 와해를 지원하는 외곽 단체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다. 아찔하고, 아연했다.
발기문에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주의와 확장주의'를 우려하고 있었다. 중국의 굴기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대아시아몽 또한 中國夢(중국몽)에 맞선 대항 담론일 터이다. 중국의 타자화가 여전하다. 20세기 초기에는 반봉건의 이름으로, 20세기 후반에는 반공의 이름으로 중국과 일백년 적대했다.
이제는 반패권의 이름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대아시아를 건설하겠단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가능하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 '一帶一路(일대일로)'를 축으로 유라시아를 종과 횡으로 엮어가고 있는 작금의 실상에 비추어 보자면, 반중 연합에 기초한 대아시아 구상이란 몽상이자 망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반서구 아시아 연대에서 반중국 아시아 연대로의 전환이야말로 지난 100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서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中國(중국)이 다시 축이 되고 있다. 세계 체제의 '재균형'이다. 국제 질서의 '민주화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이다.

▲ 새천년 부활을 꿈꾸는 초원길과 바닷길은 20세기 침묵을 강요당했던 유라시아가 세계사 격변의 현장으로 떠오르는 신호다
유라시아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를 넘어섰다. 동아시아로는 더 이상 중국을 담아낼 수 없다. 동남부 연안 중심의 개혁 개방이 기존의 세계 체제에 편입, 편승하는 적응 과정이었다면, 서부 대개발과 일대일로는 새로운 세계 체제의 개조와 재편을 꾀하는 극복 과업이다. 태평양에서 유라시아로 축이 옮아간다.
20세기형 지정학과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도 낡고 진부해진다. 국가주의는 문명권별 지역 질서를 해체하고 나라별로 쪼개어 분리 통치하는 방편이었다. 지정학은 한 몸으로 운동하던 유라시아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등으로 분화시켜 지배하는 歐美(구미)의 전략이었다. 결국 '거대한 체스판'의 卒(졸)이 되었다.
하여 새천년 초원길과 바닷길의 복원은 100년간 끊어지고 막혔던 동서의 혈로를 다시 뚫어 물류와 문류(文流)를 재가동시키는 유라시아의 再活(재활) 운동이다. 국경(Border)이 통로(Gateway)가 된다. 지리는 재발견되고, 지도는 다시 그려진다. 21세기의 大勢(대세)이고, 메가트렌드(Mega-Trend)이다.
따라서 작금의 모순과 균열을 미중간의 패권 경쟁으로 오독해서는 심히 곤란하다. 이러한 인식을 줄기차게 발신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따지는 편이 이로울 것이다. 실상은 대세와 반동(反動)의 갈등이다. 유라시아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운동과 20세기형 분열과 분단을 지속하려는 세력 간의 길항이다. 유라시아형 세계 체제를 건설하려는 세력과 유럽-아프리카, 유럽-아메리카형 세계 체제의 지속을 도모하는 세력 간의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하겠다.
세계 체제 갱신은 세계사 재인식과 동시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서구 중심주의를 중국 중심주의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럽적 가치에 동아시아의 전통을 맞세우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구미적 근대성이나 아시아적 가치론이나 자족적이고 자폐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서구를 배타하지도 흠모하지도 않는다. 근대를 폄하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
사물을 제 자리에 돌려놓을 뿐이다. 유럽을 유라시아의 서단으로 지방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근대와 전근대의 분단 체제를 허물고 유라시아적 맥락으로 東西古今(동서고금)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유럽의 자만도 아시아의 불만도 해소하는 大同(대동) 세계의 방편이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우리 또한 과거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과 고려, 발해와 신라, 고구려, 백제, 고조선을 재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我(아)와 非我(비아)의 투쟁이 전부가 아니었다. 봉건과 정체(停滯)도 아니었다. 고대니 중세도 허튼 소리였다. 영겁을 회귀하는 시간의 망망대해에서 '진보(progress)'는 근대인의 부질없는 망념이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반만년의 역사야말로 새 천년의 자산이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 극복 또한 左右(좌우)와 南北(남북)이 공히 앓고 있는 고/금 간의 분단을 해소하는 작업과 필히 연동될 것이다.
앞으로 3년간 유라시아의 (재)통합 현장을 見聞(견문)하려고 한다. 보고 들은 얘기들을 쓰고 옮길 것이다. 주축은 일대일로이다. 하지만 大路(대로)에만 편중되지도 않을 것이다. 주변의 샛길에도 눈길을 줄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에 도취되었듯, 중국몽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다. 직시하고 직문할 것이다.
유라시아는 미래파의 선언, 신상품이 아니다. 때늦은 자각이며, 뼈아픈 후회이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옛 사람의 글을 다시 읽고, 옛 사람들이 오갔던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먼지 쌓인 고(古)지도를 청사진으로 삼을 것이다. 한반도 동남단, 경주의 석굴암은 西域(서역)과 페르시아로 이어졌던 누천년 유라시아 연결망을 묵묵히 증언해주고 있다. '유라시아 견문'이 식민과 분단으로 망실해버린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내 나름의 통일 사업이고 실력 양성 운동이다.
[유라시아 견문] <서유견문> 다시 읽기
서구 몰락 예언한 유길준, 우리는 그를 몰랐다
연행록과 견문록
연초 연달아 여행기를 읽었다. <유라시아 견문> 준비 차였다. <왕오천축국전>(혜초 지음, 정수일 옮김, 학고재 펴냄)으로 출발해 <동방견문록>(김호동 옮김, 사계절 펴냄), <이븐 바투타 여행기>(이븐 바투타 지음, 정수일 옮김, 창비 펴냄), <서유기>를 지나 <열하일기>까지 내달렸다. <오도릭의 동방기행>(정수일 옮김, 문학동네 펴냄)도 곧 손에 들 작정이다.
유라시아는 오래전부터 冊(책)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종교와 사상과 문화가 흐르고 섞이는 문류망이 도저했다. 이 서물들에 대한 소회는 그때그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을미년 초두에, 연재의 서두에 각별하게 할애하고 싶은 책은 따로 있다. 유길준의 <西遊見聞(서유견문)>이다.
올해가 꼭 출간 120주년이서만은 아니다. 의외로 배운 지점이 많았다. '의외'였다는 점이 포인트다. 애당초 기대가 적었다. 명색이 동아시아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지만 개항기가 산출한 최고의 문헌을 읽어보지 못했다. 모르던 바는 아니었다. 허나 귀동냥 수준이었다. 후쿠자와 유기치의 <서양사정>을 베꼈다는 풍문이 선입견을 더했다. 구미형 근대화를 맹숭하는 개화파의 태작이려니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 미리부터 1894년 東學(동학)을 누르고 西學(서학)의 승리를 확인하는 저작으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상 책을 펼치니 빠져들었다. 만만치 않았다. 간단치가 않았다. 과연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한 법이다. 그가 궁리하는 개화의 개념과 방법이 발군이었다. 어떻게 조선의 근대를 자주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깊이 궁리하고 제안한 국정 개혁 제안서였다. 전혀 낯설지만은 않았다. 조선 사대부의 시무책을 잇고 있었다.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개혁안을 제시했던 연행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시점이 절묘했다. <서유견문>이 출간된 1895년은 마지막 연행단이 귀국한 해이기도 하다. 사정이 복잡했다. 파행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중국을 방문한 해는 1894년이었다. 하필 청일 전쟁이 발발했다. 귀환 날짜가 밀리고 밀려서 해를 넘겼다. 청의 패배가 확정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귀로 또한 생경했다. 사행단이 오가던 육로가 아니었다. 청의 군함에 실려 인천으로 들어왔다. 바다의 시대가 조선을 삼키고 있었다.
귀국 후 행적도 이전과 달랐다. 의당 수행해야 할 왕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 조청 관계가 극적으로 변했던 탓이다. 조선은 어느새 자주 독립국이 되어 있었다. 대청사행을 보고해야 할 까닭이 사라져 버렸다. 누천년 사대-자소 관계가 일시에 무너졌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평등하게 경쟁하라는 만국공법 시대가 열렸다. 조선은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연행단이 베이징에 발이 묶여 있을 무렵이었다. 연행록은 더 이상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경로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귀국은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연행록을 대신한 것이 바로 <서유견문>이었다. 유길준은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다. 도쿄에서는 일본 근대화의 사상적 대부, 후쿠자와 유키치를 사사했다. 신청년의 첨병, 신문화의 첨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열하일기>(1780년)와 <서유견문> 사이가 그리 멀지 않았다. 양자를 잇는 자리에 환재 박규수가 있었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이자, 유길준의 스승이었다. 혈연과 학연을 타고 조선의 문류도 흐르고 있었다. 북학파와 개화파, 100년을 잇는 연결망이었다.

儒學(유학)과 留學(유학)
유길준은 1856년 北村(북촌)에서 태어났다. 조선 정통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家學(가학), 즉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양질의 유교적 소양을 터득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당시 첨단이었던 경화(京華) 학계의 학풍을 섭렵했다. 소싯적부터 조선 주자학의 정수를 충분히 흡수했던 것이다.
박규수를 만난 해는 1873년. 유길준은 18세 청년이었고, 박규수는 66세 노년이었다. 환재가 별세하는 1877년까지 만년의 완숙한 사상을 전수 받았다. 청나라의 세계 지리서 <海國圖志(해국도지)>를 건네받은 것도 박규수의 사랑방이었다. 이로써 청의 양무 운동을 학습하고, 유형원과 정약용 등 조선 실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서유견문>을 비롯한 숱한 시무책에도 논어, 맹자, 주자는 물론, 실학파들의 연구 성과가 크게 참조되었다.
유길준은 구미 유학을 통하여 개화파로 전향했던 것이 아니다. 조선을 떠나기 전에 이미 개화파였다. 조선의 전통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일부를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자생적 개화파로 거듭났던 것이다. 즉, 유교적 變通(변통)론의 연장선에서 구미 문명을 수용했다고 하겠다. 때문에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유학생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면할 수 있었다. 유학하는 국가에 대한 맹목과 맹종을 거두었다. 조선적인 것을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쓰기는커녕,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단단했다. 자학과 자만 너머에 떳떳한 자긍을 세웠다.
이러한 태도는 국한문 혼용체로 표출되었다. <서유견문>은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문헌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하다. 유길준은 몸소 문법책을 저술했을 만큼 문체 연구에도 열심이었다. 모름지기 문체는 사상의 뼈대이다. 그가 漢文(한문) 탈피를 표방했음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國文(국문)이 곧 漢字(한자) 탈피는 아니었다. 한자 또한 국문의 하나였다. 아니 가장 오래된 국문이었다. 도무지 한자를 버릴 수는 없었다.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새로운 국문이요, 새 시대의 문체였다. 이 또한 한글 전용으로 내달리며 일어와 영어에 복무했던 설익은 개화파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었다. 그는 문체에서도 동서고금 균형을 잃지 않았다. 즉, 국한문 혼용은 비단 한글 전용으로 가기 위한 이행기의 흔적이 아니었다. 나름의 고금 간 통합술이었다. 그래서 漢學(한학)에 함몰되지도 않고, 國學(국학)에 매몰되지도 않는 내재적 지역학(Area Studies)으로서 또 다른 東學(동학)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西學(서학)으로 단련된 儒學(유학), '지구 지역학(Glocalogy)'으로서의 동학 말이다.
개화와 중도
그만큼 개화파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인도 절감했던 모양이다. 스스로 개화의 등급을 나누었다. 유길준에게 개화는 곧 근대화가 아니었다. 서구화는 더더욱 아니었다. 일본 따라잡기, 미국 따라 하기와 일선을 그었다.
무릇 개화란 인간의 천사만물이 지선극미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컬었다. 까닭에 개화의 여부를 한정할 수가 없었다. 개화에는 종점이 없으며, 고로 역사에도 종언이 없었다. 역사란 변혁과 성쇠의 순환이지, 진보와 발전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가 견문한 구미 또한 문명의 정점, 개화의 최종 형태가 아니었다. 아니, 서구 문명을 '진(眞)개화'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 처지가 어찌될지 알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과연 20년 후에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1914년)이 발발했고,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이 출간된 것은 1918년이었다.
우유부단함이 아니었다. 得中(득중)의 태도였다. 개화한 자는 천만가지 사물의 이치를 따지고 밝혀 경영하는 자이다. 따라서 날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했다. 남의 장기를 취하되 자기의 장점도 키워야 했다. 처지와 시세를 감안한 후 제 나라를 보전하면서 개화의 공을 이루어야 했다. 추수가 아니라 혁신이었다. 변혁적이되, 중도적이었다.
때문에 개화당과 수구당을 공히 비판했다. 갑신정변에 호통을 쳤다. 시세와 처지의 분별없이 남 것만 숭상하고 제 것을 업신여긴 착오를 범했다고 했다. 그래서 '개화의 죄인'이었다. 반대로 남 것은 덮어놓고 오랑캐라며 배척하고 제 것만 천하제일인양 여기는 수구당은 '개화의 원수'라고 질타했다. 또 주견 없이 남의 겉모습만 따르는 자는 '개화의 병신'이라 일갈했다.
즉, 그의 득중이란 좌/우, 보수/진보 사이에서 회색 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과 서, 고와 금에서 중용을 지키는 자세였다. '전통 없는 근대'가 개화의 죄인이라면, '근대 없는 전통'은 개화의 원수였다. 기민함과 완고함의 차이가 있을 뿐, 분별력이 모자라고 몰주체적임은 개화파도 수구파도 마찬가지였다.
개화의 여실은 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었다. 핵심은 교화된 인민의 존재였다. 開化(개화)는 敎化(교화)의 산물이었다. 개화는 곧 進化(진화)이기도 했다. 경쟁이 적자생존, 우승열패를 의미하지도 않았다. 진화와 경쟁을 향상심을 발동시키는 수양이자 격려로 수용했다. 내면의 수련을 통한 교화의 최종적 결실이 개화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래서 득중을 먼저 이룬 자가 지나친 자를 타이르고, 모자란 자를 다독일 것을 권장했다. 민중을 추키지도 않았고, 대중을 깔보지도 않았다.
결국 두루 선비가 되는 나라, 國民皆士(국민개사)론을 제창했다. 훗날 興士團(흥사단)도 설립했다. 서구의 시민이 '재산'에 기초한 주체라면, 동방의 시민은 '덕성'에 바탕을 둔 주체였다. 그래서 민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절차(선거)만큼이나 민의 인격적 도덕화를 강조했다.
아니 정부의 역할 자체를 사람의 귄리 보장(복지국가)에 보태어 사람의 도리 교화(인문국가)에 있다고 여겼다. 정치란 불완전한 인격체를 조금씩 조금 더 나은 인격체로 진보시키는 학습과정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유견문>에서 피력하고 있는 이상적인 개화 또한 법치와 덕치의 최종적 상태인 '無爲之治(무위지치)'에 근사했다. 그는 천상 사대부, 개항기의 개화된 사대부였다.
진개화
유길준의 독보를 추앙하려는 뜻이 아니다. 단독자도 아니었다. 눈을 유라시아로 돌리면 여럿이었다. 중국에는 <大同書(대동서)>를 집필한 캉유웨이가 있었다, 향촌 건설 운동의 량수밍도 있었다. 인도에는 타고르가 있었고 간디가 그 뒤를 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폐허에서는 자말 알딘 알아프가니가 고투했다.
각자 처한 장소는 달리했지만, 동서고금을 회통하는 진개화를 궁리했다는 점에서 동지이고 반려였다. 현실에서는 좌절했다. 20세기는 사나웠다. 설익은 개화파, 웃자란 쭉정이들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들의 후예가 개발파와 개혁파였다. 산업화는 따라잡았고 민주화도 따라했다. 하건만 나라꼴도 지구촌도 갈수록 흉흉하다. 헛 개화의 末路(말로)이다.
판 갈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탈냉전은 또 다른 개항기였다. 대륙으로 유라시아로 다시 길이 열렸다. 왕년의 초원길, 바닷길에 하늘길까지 분주하다. 고로 포스트모던(Post Modern)은 치우진 독법이었다. 서구적 근대의 종언이자 탈서구적 근대의 개막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유라시아는 그 지구적 근대의 中原(중원)이다. 20세기에 억압되었던 역사의 무의식이 중국몽, 인도몽, 아세안몽, 이란몽, 터키몽으로 피어난다. 유라시아로 방향을 선회(U-tun)하여 견문을 이어가는 까닭이다. 헛개화를 거두고 진개화를 이루는 새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기를 소망한다. 개화는 여전히, 영원히 진행형이다.
[유라시아 견문] 21세기 중화망 : 치앙라이
마약왕이 된 반공열사, 골든트라이앵글의 비밀
마에살롱(Maesalong)
<서유견문>을 읽어간 곳은 치앙라이(Chiang Rai)였다. 태국(타이) 최북단, 미얀마(버마)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다. 부모님이 두세 달 겨울을 나시는 피한(避寒)지이다. 날씨는 포근하고 공기는 깨끗하며 물가는 저렴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앉아 오래된 여행기들을 하나씩 살펴갔다.
하루는 부모님이 짧은 여행을 권하셨다. 주변 지역 일대를 둘러보자는 것이다. 숙소를 떠난 차는 구불구불 산으로 향했다. 마에살롱(Maesalong)이라는 고산 마을에 가는 길이라 했다. 산세가 제법 근사했다. 흡사 운남(雲南)의 계림(桂林)을 닮았다.

▲ 치앙라이 마에살롱 전경. ⓒwikimedia.org
한참을 오르니 벚꽃이 피었다. 태국은 사시사철 여름인 줄만 알았다. 산 속은 또 그게 아닌 모양이다. 2월 초, 때 이른 봄맞이에 기분이 절로 청량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녹색 차밭이 넓게 펼쳐졌다. 차밭이 관광 코스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런 곳이라면 이미 여러 곳 둘러본 적이 있다. 오히려 내 시선을 잡아 끈 것은 커다란 공자상이었다. 옷차림이나 얼굴 생김새, 아무래도 공자였다. 태국 차밭에 어인 공자상인고? 의아하고 궁금했지만 물음을 삼켰다. 태국어는 모르고 영어는 통하지 않으니, 마땅히 물어볼 길이 없었다.
산을 더욱 오르자 길 주변으로 숙소와 찻집, 밥집이 늘어났다. 덩달아 한자 간판들도 불어났다. 표기의 순서는 산 아래와는 반대였다. 한자가 먼저이고 태국어가 뒤를 이었다. 신기한 일이로세, 흥미가 돋던 차 '興華中學(흥화중학)'이라는 표석이 눈을 찔렀다. 흥화, 中華(중화)의 重興(중흥)이란 뜻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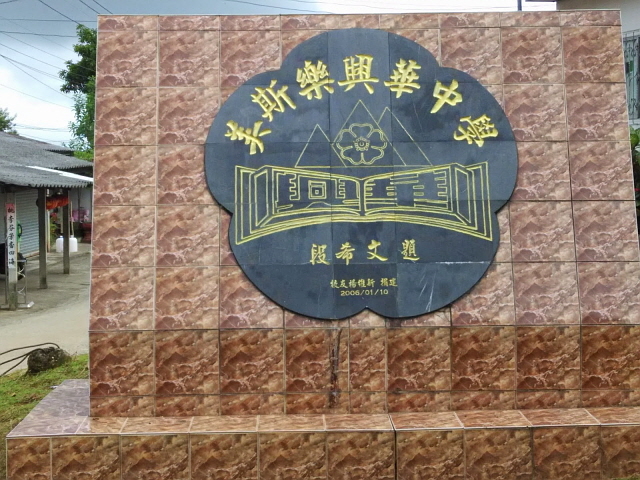
▲ "興華中學(흥화중학)이라는 표석이 눈을 찔렀다. 흥화, 中華(중화)의 重興(중흥)이란 뜻이렸다." ⓒ이병한
대체 이 마을의 정체가 뭐 길래? 호기심이 마구 솟아났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학교부터 카메라에 담았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찬찬히 살피니 유독 잦은 이름이 보였다. "段將軍(단장군)". 단장군 카페, 단장군 호텔, 단장군 식당 등 여럿이었다. 단장군의 묘지를 안내하는 표지도 있었다.
부모님은 시장 구경 중이셨다. 자연산 송이버섯을 고르며 흥정이 한창이었다. 곁에 이르자 이번에는 주인아주머니의 말이 귀를 찔렀다. "쩌이거싀하오츠더". 소리는 문자로 전환되었고, 의미가 되어 해독되었다. '这个是好吃的', '이거 맛있어요.' 어라? 나는 곧장 되물었다. "니싀쭝궈런마?(你是中国人吗?)" '중국인이세요?' "是的". 그렇단다.
이번엔 똥그래진 눈으로 그쪽에서 물어왔다. "어떻게 중국말을 해요? 홍콩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에요. 베이징이랑 상하이에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통성명이 끝나자 말문이 터졌다. 마침내 이 마을에 대한 궁금증을 해갈해줄 분을 만난 것이다.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저 단장군이라는 분은 누구죠?" 나는 점점 20세기 중엽, 동아시아 냉전사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 '단장군' 묘지 입구. ⓒ이병한
냉전의 마을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일어섰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대륙은 원체 크고 넓었다. 건국 선언에도 大一統(대일통)은 미완이었다. 특히 서남부 내륙이 그러했다. 운남성에는 여전히 중화민국을 받드는 세력이 있었다. 93사단과 237사단을 주축으로 한 소위 '국민당 잔군'들이다. 그들에게 베이징은 아득한 곳이었다.
인민해방군이 남진하여 이들과의 격전 끝에 쿤밍(昆明)을 장악한 것은 1950년 1월이었다. 항복을 거부한 일부는 남하하여 버마(미얀마)의 정글로 숨어들었다. 항일 전쟁기 미국이 중(화민)국의 물자 보급을 도왔던 '버마 로드(Burma road)'가 국민당판 '대장정'의 피난길이 되었다. 갓 독립(1948년)한 버마는 잔군들이 불편했다. 그러나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으로 단련된 그들의 전투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잔군들은 버마의 만사(Mansa, 孟薩)를 국민당의 '옌안(延安)'으로 삼고자 했다. 이름도 거창했다. 雲南反共救國軍(운남반공구국군)이라 개칭했다. 와신상담의 기회는 때 이르게 찾아왔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신중국이 참전했다. 서남부에 배치되었던 인민해방군이 대거 북진했다. 군사력의 공백이 생겨난 것이다.
운남성 탈환과 대륙 수복, 대역전의 틈이었다. 국민당과 미국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대만(타이완)은 전술 훈련을 담당할 교관을 파견했다.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反共抗俄大學(반공항아대학)도 세웠다. 抗日(항일) 이후의 抗俄(항아)를 선전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의 괴뢰라고 가르쳤다. 중국의 내부 정보에 굶주리던 CIA(미국 중앙정보국)는 구국군을 낙하산 부대로 훈련시켜 내륙으로 침투시켰다. 그래서 1952년까지 총 7차례 운남성 공격을 감행했다. 1953년 한반도의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전선은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
구국군은 갈수록 세를 더했다. 버마와 태국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도 끌어들였다. 중국인과 아시아 제민족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東南亞人民反共聯軍(동남아인민반공연군)을 결성했다. 곤혹스런 버마 정부는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유엔 총회에서 중화민국을 꼬집어 지목했다. 버마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잔군을 철수시키라는 요구였다. 당시 중화민국은 엄연히 유엔 상임이사국의 하나였다. 세계 5대국의 체통이 달려 있었다. 장제스는 운남반공구국군의 해산을 선포했다. 그러나 시늉뿐이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정예 부대는 남겨 두었다. 자신의 명령을 어긴 불복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발뺌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5년 반둥회의 이래 탈식민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직접 장제스에게 완전 철군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중지하겠노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1961년 두 번째 철군이 단행되었다. 이번에는 대규모였다. 대만에선 대대적인 '귀국' 환영 행사가 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는 남았다. 그들에게 대만은 낯선 땅이었다. 歸國(귀국)이 아니라 歸鄕(귀향)을 꿈꾸었다. 결국 중화민국 군적 자료는 소각시켰다. 잔군은 이제 '고군(孤軍)'이 되었다. 타향을 떠도는 무적자(無籍者)였다.

▲ 단장군, 뚜안시원(段希文). ⓒ이병한
버마서도 쫓겨난 이들은 다시 산을 타고 넘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마에살롱이었다. 그 4000명의 군인과 식솔들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단장군, 뚜안시원(段希文)이었다.
그러나 거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생계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국민당의 지원마저 끊어진 마당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피난길을 상로(商路)로 전환시켰다. 버마와 태국의 국경 무역을 중계했다. 상품은 단연 아편이었다. 해발 1800미터의 고산 지대라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격이었다.
단장군은 이렇게 강변했다. '우리는 공산주의 원수와 계속 싸워야 한다.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는 총이 필요하다. 총은 돈이 있어야 하며, 이 산지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편뿐이다.' 그리하여 버마, 태국, 라오스의 강줄기가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은 냉전기 동남아 아편 무역의 허브가 되었다.
생계책을 세웠다 해도 무적자의 신분은 불안한 것이었다. 태국 정부 또한 공짜로 망명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을 태국의 반공 작전에 투입키로 했다. 버마를 접경한 북부 산악 지대는 태국 공산당의 거점이었다. 신중국을 추종하는 '붉은 화교'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을 토벌하는데 전직 국민당군의 복수심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1970년 12월 단행된 대규모 토벌 작전에도 이들이 맨 앞자리에 섰다. 5년간 지속된 토벌로 1000명 이상의 빨치산을 소탕했다. 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고 신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태국 북단에서도 동남아의 좌우 대결로서 유사-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완전 진압은 1982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태국 정부는 상찬을 표했다. 덕분에 한반도나 베트남, 중국처럼 태국이 분단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국왕이 직접 노고를 치하하며 태국 국적까지 부여했다. 마침내 합법적인 주거의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로써 운남에서 버마로, 태국으로 이어진 피난과 유랑 생활도 마감할 수 있었다. 총을 내려놓고 차를 재배했다. 생활 세계의 탈냉전이었다.
단장군이 눈을 감은 것은 1980년이었다. 그의 무덤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남중국풍이 물씬한 사당처럼 꾸몄다. 그의 인솔 아래 중국공산당, 버마공산당, 태국공산당과 차례로 싸우다 숨진 부하들의 명패도 모셔져 있었다. 일종의 반공열사릉이었던 셈이다. 파란의 동아시아 현대사가 응축된 상징적인 장소였다.
좌파(Left)를 청춘의 패션으로 치장했던 20대 시절이었다면 우익분자들이라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마저 좌/우로 갈랐던 저 우매한 20세기와는 작별을 고한 지 이미 오래였다. 나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들의 소망이었던 '興華'를 두 손 모아 기도했다.

▲ 반공열사 명패. ⓒ이병한
Network-中華帝國
빨치산 토벌로 통제되었던 마에살롱은 1994년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태국 정부는 산티키리(Santikhiri)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평화의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마에살롱'에 각인되어 있는 냉전의 추억과 아편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다. 지금은 그 예외적 역사적 배경에 자연 풍광이 어울려 태국의 10대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다.
저 푸르고 너르던 차밭이 본래는 양귀비를 키우던 곳이었다는 말이다. 마약 기운이 스며든 땅에서 자란 차인지라 특히나 맛있다는 우스개도 있었다. 산티키리는 운남성 본산의 고급 우롱차를 주로 생산한다. 해발 1200~1400미터가 우롱차 재배의 최적지이다. 그래서 치앙라이 주 생산량의 80%를 이 마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커피와 과수, 약초 재배도 시작했다. 산티키리의 판로는 다국적, 초국적이었다. 태국은 물론이요 중국과 대만, 동남아 화교/화인 사회까지 넓게 퍼져있었다. 中華網(중화망)의 한 연결 고리였다.
기실 치앙마이(Chiang Mai)에 속해 있던 치앙라이가 독립된 한 주로 승격된 것부터 탈냉전의 소산이었다. 중국과 태국을 잇는 고속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낙점되면서 투자 건설이 부쩍 활발해졌다. 고속철 노선도를 따라서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이 속속 세워지고 있었다.
마에살롱의 2세와 3세들에게도 기회의 창이 열렸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덕에 산 아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주요 여행지의 안내 표지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호텔 조식의 식단 또한 변해가고 있었다. 커피만큼이나 우롱차를 마시며, 베이컨과 스크램블의 옆자리에는 쌀죽과 국수가 자리했다. 햄버거 대신에 만두를, 콜라보다는 매실차를 마실 날이 머지않았다.

▲ 태국 최북단의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치앙라이는 또 다른 운남성으로 변하는 중이다. 말 그대로 21세기 중화망의 현장이다. ⓒ이병한
실은 마에살롱에서 점심 끼니를 때웠던 국수집에서부터 중국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막을 보니 간체자, 대만이 아니라 대륙 방송이었다. 짐작으로는 운남성에서 발신하는 방송이지 싶다. '작은 운남' 마에살롱은 그렇게 위성 전파망을 통하여 고향과 접속하고 있었다. 그들이 향수(鄕愁)하는 대상 또한 國土(국토)보다는 鄕土(향토)에 가까웠다. 혹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보다 한층 근원적인 대지로서 역사적/문화적 '中國(중국)'을 향한 것이었다. 운남과 마에살롱, 향토와 향토를 잇는 연결망, 인터로컬리즘(Inter-localism)의 발현이다.
태국의 영자 신문을 사려고 들렀던 편의점에서는 중국어 신문이 두 종류나 배치되어 있었다. 내가 고른 것은 <세계일보(世界日報)>였는데, 읽다보니 태국의 화교/화인 신문이었다. 번체를 고수하는 것만 보아도 중화민국의 후예들이었다. 그럼에도 사설은 남달랐다. 오는 9월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만의 총통도 초대해서 공동 행사를 열라며 시진핑에게 제안하고 있었다. 실제로 1945년 항일 전쟁 승리의 주역은 국민당이고 장제스였다. 태국의 화교/화인들에게 할아버지/아버지 시절의 국공 분열, 좌우 투쟁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았다. 신세기 새 세대들이 양안의 화해와 통합을 선도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세기 중화망은 대륙과 대만의 안과 밖으로 국민 국가(nation state)를 돌파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중화제국의 갱신으로서 복합 국가로 진화 중이며, 밖으로는 전 지구적 화교/화인 사회와 연결된 네트워크 국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둘을 합하면 '네트워크 중화 제국'의 부상이다.
따라서 양안의 통일 또한 못다 이룬 영토국가의 때늦은 달성과는 성격을 달리 할 것이다. 국민 국가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중화 제국의 복원과 네트워크 국가의 실현에 가까울 법하다. 마에살롱의 뿌리, 운남성이 동남아와 인도양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 되었음은 상징적이다.
지난 세기 국공내전의 파장으로, 양안 분열의 확산으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동남아의 내전과 냉전이 거듭되었다. 대륙은 그 규모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제는 네트워크 중화 제국의 굴기가 이웃으로 커다란 파급을 일으키고 있다.
목하 중국풍이 드세게 불고 있는 제주도의 고뇌 또한 국지적인 동시에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현장이라 하겠다. 아직은 순풍일지 삭풍일지 가늠하기 힘들다. 일대일로 건설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21세기 중화망이 낙수 효과를 선사할 것인지, 침수 효과를 빚어낼 것인지 신중하게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겠다.
마침 태국의 영자 신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에서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구상과 아세안의 미래를 토론하는 학술 회의가 예고되어 있었다. 단박에 솔깃한 주제였다. 현장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유라시아 견문] 방콕의 춘절
중국 '춘절'이 미국 '크리스마스'를 대체할까?
하늘길
치앙라이에서 방콕까지는 하늘길을 이용했다.
이륙 후 한 시간 반이 지나자 돈므앙 공항에 도착했다. 유서가 깊은 공항이다. 1914년에 개장했으니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 세월만큼이나 사연도 구구하다. 무엇보다 베트남 전쟁과 악연이 깊다. 미국 공군이 주둔하는 베트남 폭격의 전초 기지였다. 폭격기의 80%가 이 공항에서 출격했다. 정점을 찍었던 1969년에는 당사국이었던 남베트남보다도 많은 미군들이 돈무앙에 근무했다. 태국(타이)은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붉은 인도차이나' 저지의 핵심 보루였던 것이다.
태국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시암(Siam)과 월남(越南)은 오랜 앙숙이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두고 18세기부터 치열하게 경합했다. 특히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고수했다. 이웃 라오스 왕정도 은밀하게 지원했다. 그리하여 동남아의 내전과 냉전은 좌우 대결만큼이나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길항으로도 치열했다. 베트남의 인도차이나주의와 태국의 범타이주의의 알력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1961년 주둔을 시작한 미 공군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1976년이었다. 1975년 베트남 통일(4월)과 라오스인민공화국의 수립(12월)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그들의 임무는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미국 본토나 하와이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일본으로 '복귀'(1972년)한 오키나와로 거처를 이전했다. 이로써 오키나와는 세계 최대의 미 공군 기지가 되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오키나와 문제의 불씨를 더욱 키운 것이다.
군항기가 떠난 돈므앙만큼은 민항기의 전성기를 맞았다. 미군이 전투의 고단함을 달래고자 방콕을 휴가지로 삼았던 전쟁기의 유산(Rest & Recreation)이 관광 산업 부흥이라는 역설을 낳았다. 초창기 손님들은 거개가 미국과 유럽 출신이었다. 동양에서의 유흥과 환락을 탐했다. 1980년대부터는 일본,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배낭족들도 방콕을 찾았다. 명실상부 동남아 여행의 허브이자 배낭 여행의 메카가 된 것이다. 새 천년에는 단연 대륙의 요우커(旅客)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여 돈므앙만으로는 더 이상 여객들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2006년 규모를 대폭 늘린 수완나품 공항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 돈므앙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2007년 재개장했다. 그러나 태국을 찾는 손님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신공항의 수용 한계치를 훌쩍 넘어서버렸다. 특히 아세안 내부의 인구 교류가 확대일로이다. 2000년 이후 매해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아세안 창구를 따로 두었을 정도이다.
역내 인구 이동의 폭발로 아시아 저가 항공사들도 활황을 누리고 있다. Air Asia, Nok Air, Orient Airline, Viet Jet 등 다양하다. 돈므앙은 아시아 역내 교류를 주도하는 저가 항공사들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였다.
돈므앙의 주요 연결망을 보노라면 그 성격이 한층 도드라진다.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호치민, 양곤, 충칭, 자카르타, 광저우, 우한 순으로 연결 빈도가 높다. 아세안과 남중국이 하나의 권역으로 엮이고 있는 것이다. 이 하늘길을 오고가는 사람들도 왕년의 정부 관료, 대기업 임원, 교수 등이 아니다. 보따리 장사부터 가족 여행까지, 쇼핑과 관광이 대세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놀고 쉬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변동, 생활 감각의 변화이다. 당장 나만 해도 저가 항공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사회주의 티를 낸답시고 베트남은 외서 반입에 유독 까탈이다. 검열에 세금까지 왕창 매긴다. 해서 영어와 일어, 중어 책을 구하려면 방콕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오는 편이 낫다. 왕복 10만원 남짓이니, 해외 배송에 견주어 남는 장사이다. 게다가 서점 또한 기노쿠니야(紀伊国屋). 도쿄 유학 시절 애용했던 일본 대형 서점의 해외 지점이다. 여러모로 아시아가 하나의 생활 세계가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Global 春節
돈므앙 공항은 붉게 치장되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거리도 온통 홍색 물결이었다. 때는 마침 설날 무렵, 중국식으로 '春節(춘절)'이었다. 최고 기온 37도, 방콕의 새봄맞이가 한창이었다. 우연찮게 차이나타운도 통과했다. 규모와 발전 면에서 동남아 으뜸을 자랑한다는 야오와라트(Yaowarat) 거리를 지나갔다.
200여 년 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지금은 50만 명의 화교/화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조상들은 시암의 왕궁과 사원을 짓는 건설 노무자였다. 후세들은 선조들의 이동로를 따라 남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상업망과 무역로를 발전시켰다. 거개가 광둥성(廣東省) 출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조주화(潮洲话)가 통용되었다. 광둥성 동편의 토박이말이다.

▲ 태국(타이) 방콕의 차이나타운. ⓒ이병한
올해 춘절은 특별히 남달랐다. 중국 문화부 부부장 쟈오웨이쉬(赵维绥)가 몸소 중국 8개 지역의 예술단을 이끌어 방콕을 방문했다. 거리는 홍등으로 장식되고 용춤 퍼레이드도 펼쳐졌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신춘(新春) 고객들에게 새해 운수를 봐주며 홍색 봉투를 선물했다. 대륙 못지않게 흥이 올랐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매력 공세였다.
기실 태국에서 음력설은 공휴일도 아니다. 중화 세계의 외부였던 것이다. 춘절은 차이나타운의 마을 행사에 그쳤을 것이다. 올해로 본토 예술단 방문 5년차, 이제는 1~2월 방콕 여행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방콕 시민들은 물론이요, 태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만인의 축제가 된 것이다.
각국의 여행객들은 동방의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밤새도록 붓고 마셨다. 현지의 태국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절과 사원을 찾아 부처님께 새해 복을 빌었다. 2015년, 조선이 陽曆(양력)을 도입한 지 어언 120년이다. 지난 세기 양력의 유입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전 지구적 축제가 되어갔다. 그러하면 이번 세기, 춘절이 세계적인 봄맞이 행사로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갈 것인가?
차이나타운의 한자 표기는 '唐人街(당인가)'. 당인들의 거리라는 뜻이다. '당인'이란 애당초 종족도, 민족도, 국민도 아니었다. 대당 제국에 거주하는 만국(萬國)인들, 세계 시민(cosmopolitan)의 원조였다. 내 가방 속에는 <대당 제국과 실크로드>라는 일본 책이 들어 있었다. 수도 장안의 일상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어렴풋이 21세기의 지구촌이 비치는 듯했다.
런던과 뉴욕, 테헤란과 뭄바이를 붉게 물들이는 춘절을 상상해 본다. 한참 꿈 나래를 펼치던 차, 저 앞으로 "China and the AEC under the new silk road"라는 플래카드가 보였다. 몽상을 거두고 이성을 깨웠다. 회의장 문을 열고 현실계로 들어섰다.


대중화 공영권?
해양 실크로드 구상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16차 아세안-중국 정상 회의였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 발전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전략적 신뢰와 이웃애를 증진시키자고 역설했다. 시진핑 주석 또한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주창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을 보태었다.
두 지도자가 임기를 다하는 2022년까지 '一帶一路(일대일로)'는 열쇠 말이 될 것이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중국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숱한 회의에서 줄기차게 듣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아세안 또한 올해 또 한 번의 역사적 획을 긋는다. 오는 12월, 인구 6억의 단일 시장 AEC(ASEAN Economic Community)로 진화하는 것이다. 마침내 무비자, 무관세의 장벽 없는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다. 특기할 점은 아세안 국가 간 장벽 허물기에도 중국의 역할이 다대하다는 것이다. 미얀마-태국 간 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태국과 라오스 간 다리를 놓으며, 라오스와 베트남을 잇는 철도를 보수해주고 있다.
실로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미합중국에 이은 중국의 3대 교역 상대이다. 2014년 중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8.3% 증가했다. 평균 4.9%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이다. 양자의 교역액은 4800억 달러, 올해는 5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면 산출 표기가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일지 모른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는 중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며,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은 중국과 교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또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는 중국의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기도 하다.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투자는 2020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해양 실크로드 건설에 투입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빗대는 경우가 있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갈라치기(devide and rule)였다. 서유럽을 소련과 동유럽에서 분리하고, 자유 아시아를 공산 아시아와 분할하는 정책적 방편이었다.
유라시아의 서단과 동단을 아메리카와 접속시킴으로써 소련과 신중국을 축으로 한 유라시아를 봉쇄하는 전략이었다. 분할과 분단으로 유라시아의 통합을 가로막는 것은 지금껏 '거대한 체스판'을 다루는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방침이다. 연결과 통합을 지향하는 일대일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퍽이나 우호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서방의 지역 통합(NAFTA, EU)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구분 짓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서구형 지역 통합은 '경제적 자유화'를 핵심으로 삼는다. 다자 간 협정으로 교역과 투자를 위하여 국가 간 법률과 제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일한 규칙과 표준을 마련한다. 자본의 운동을 최대화, 최적화할 수 있는 '평평한 세계'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지역 통합은 '교류의 촉진'에 있다. 시장의 연결망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교역과 투자를 강화한다. 가령 교통망과 통신망의 확충, 인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라시아를 순환하는 범대륙적 회랑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특정한 제도와 가치, 표준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체 통합 과정을 규율하며 '체제 이행'(Regime Change)을 요구하는 초국가적 관료 기구도 필요치 않는 것이다. 역시나 꽤나 호의적인 평가이다. '대중화 공영권'에 대한 우려로 치열한 난상토론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다소 김이 빠졌다.
세대 교체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 학술회의는 태국의 중앙은행인 태국은행이 주최했다. 그런데 태국은행을 좌지우지하는 막후 자본가들이 화교/화인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태국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태국 돈줄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화교/화인 자본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일조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쌓인 대륙의 부가 이제는 주변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태국 및 동남아의 화교/화인 자본가들이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구상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아니, 그들이야말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선구자라고 자임할 법도 하다.
정치적으로도 무척 미묘한 시점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파행을 거듭하던 태국 정계는 지난해 다시금 군부가 전면 등장했다. 내년 초까지 한시적인 계엄령 상태이다. 미국은 조기에 민간 정권으로의 이행을 독촉하고 있는 반면에, 군사 정권은 태국에는 태국의 사정이 있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히 2월에는 양국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다니엘 러셀이 태국의 한 대학 강연에서 현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육군 참모총장 출신 프라윳 총리가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태국은 미국의 오래된 맹방이다. 양국의 우호 조약은 1833년에 체결되었고, 방콕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미국 대사관이 자리한다. 그만큼 태국 정부가 미 대사를 직접 소환하여 항의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 틈을 비집고 중국이 파고드는 형세이다. 의례 '내정 불간섭'이라는 '신형 대-소국 관계'의 원칙을 앞세웠다. 사사건건, 시시콜콜, 시비를 걸지 않는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식 일당 통치를 따르라고 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중국 문화부는 양국의 우의를 기리는 춘절 선물이라며 태국 정부에 백옥 사자상을 선물했다.
이에 화답하듯 왕실의 둘째 공주 시린돈(Sirindhorn)은 중국식 전통 복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문화 행사를 관람했다. 시린돈 공주는 노환이 깊은 푸미폰(Bhumibol) 국왕이 세상을 등지면 왕관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태국은 여왕 계승을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진즉에 마쳤다.
작금의 군부 통치 또한 '민주화로의 재이행'보다는 두 공주와 막내 왕자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여 왕위 계승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밀실 정치라는 설이 유력하다. '태국의 사정'이란 것도 이러한 정황을 말하는 것일 테다. 전통적으로 태국 군부는 정권보다는 왕실에 충성했다. 정권은 바뀌어도, 왕가는 지속된다. 국군보다는 황군에 가깝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 즉위부터 현재까지 오롯이 미국의 패권기와 함께 일생을 보냈다.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혁명에 맞서 미국 편에 가담했던 것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보다는 입헌 군주제의 보위에 있었다고 하는 편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동남아 혁명을 옹호했던 신중국은 푸미폰 국왕의 주적이기도 했던 것이다.
하기에 그의 딸이 직접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춘절을 즐기는 현재의 모습이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에도 능통하며 태국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이기도 하다. 태국 왕실에 흐르고 있는 남중국계의 핏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계가 변화하고, 그 달리진 세상을 이끌어갈 세대도 교체되고 있다.
그 변화하는 세계의 단적인 단서로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태국은 2014년 베이징에서 일찌감치 AIIB 가입을 공식화했다. 돈므앙 공항과 방콕 시내를 잇는 고속도로에도 'Global Financial Bridge'라는 중국공상(工商)은행의 광고판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전 지구적 금융 질서가 가파르게, 확, 달라지고 있다. AIIB의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겠다.
[유라시아 견문] AIIB : 신 동방 무역 시대
영국도, 독일도 미국을 버렸다!
영국의 작심
'미국의 푸들'이 변했다. 이라크 침공을 비롯하여 미국에 충성했던 영국이 단단히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참여를 만류했던 미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가입을 결단한 것이다. 재고(再考)와 장고(長考) 끝의 승부수이다. 그래서 變心(변심)보다는 作心(작심)이 어울리겠다.
그간 줄을 잘못 섬으로써 오명과 손실이 다대했다. 명예는 실추되었고, 살림은 팍팍해졌다. 국가의 노선을 변경치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이어서 더욱 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멀게는 산업 혁명의 원조이며, 가깝게는 신자유주의의 고향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임을 인정하고 중견국(Middle Power)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아편 전쟁 이래 200년의 세계 체제가 저물어간다.
현재의 금융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된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도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논의가 활발했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비치자 일본이 몸을 사려 뜻을 굽혔다. 미봉책에 그침으로써 병을 더욱 키웠다.
2008년, 이제는 뉴욕이 세계적 금융 위기의 화근이 되었다. 이번만큼은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토록 혁신이 더딘 타성적 조직이라면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판을 엎고 새 판을 짜는 것이다. AIIB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의 하나가 마침내 도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AIIB는 창설국들의 국내 총생산(GDP)에 기초해 지분을 할당할 계획이다. 미국이 향유하던 거부권도 중국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구할 제도 마련도 '합의제'에 근거할 것이다. 주도국의 아량과 도량을 베풀어 주저하던 서방 국가들의 동참을 견인해낸 것이다. 德治(덕치)이고,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이다. 세계 질서는 점점 더 재균형(rebalance)을 향해 '민주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거버넌스 차이도 확연해졌다. AIIB 출범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의 자충수 성격이 강하다.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신흥국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IMF 개혁 법안을 5년째 보류시킴으로써 정작 자국이 주도하던 국제 금융 기구의 쇠락을 앞당긴 꼴이 되었다.
미국 의회는 AIIB 참여에도 부정적일 공산이 크다. 그럼으로써 영향력 상실을 더욱 부추겨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낼 것이다. 반면 AIIB는 구상부터 실현까지 불과 2년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월말 보아오(博鰲) 포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서는 실무자 회의까지 열렸다. 一瀉千里(일사천리), 중국식 세계화를 이끄는 '책임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영국의 작심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국가들의 가입이 봇물을 이루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공동 발표의 형식을 취했다. 이로써 유럽 4대국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확연하게 유럽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Pivot to Asia)하고 있다. 유라시아도 점점 실체가 되어간다. 덕분에 아시아의 중소 규모 국가들도 중국 독주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다. 중국 또한 '신식민주의'의 혐의를 벗어낼 수 있었다.
영국의 편승 전략은 합당한 귀결이다. 영국은 21세기에도 런던을 세계 금융의 허브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필히 중국의 인민폐와 접속해야 한다. 여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자국의 금융계와 산업계에 활로를 열어주었다. 장차 유라시아에 펼쳐질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 기회론'이 '중국 위협론'을 삼켜버렸다.
실제로 유로존 위기 이후 중국의 유럽 투자는 확대일로이다. 2011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2014년에는 1조8000억 달러에 달했다. 영국에선 금융 상품을 구입하고, 독일에선 선진 기술에 투자하고, 그리스에서는 항만을 건설하고, 포르투갈에서는 은행을 구제하며, 스페인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한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방향만은 아니다. 유로 하락으로 유럽의 수출이 늘고 있다. 그 수출길이 대저 아시아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 많은 인구에 바탕 한 유라시아의 소비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찍이 마르코 폴로는 유럽을 아시아와 연결시켰다. 아니 이미 연결되어있던 길을 따라서 유럽에 아시아를 소개했다. 동방의 국수는 누들 로드를 따라 지중해를 만나 스파게티가 되어갔다. 파스타도 유라시아적 교류(Made in Eurasia)의 산물이다. 마침 올해는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정상화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러피언 드림과 중국몽이 합류하여 유라시아 르네상스를 예비한다. 미국이 유럽에 손짓했던 환대서양 르네상스(Trans-atlantic Renaissance)는 死語(사어)가 되었다.

ⓒoccuworld.org
독일의 회심
유럽의 심장은 독일이다. 영국의 작심이 상징적이라면, 독일의 回心(회심)은 실질적이다. 유라시아로의 이행과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대륙 국가, 독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메르켈 총리의 주관 아래 개막식이 열린 하노버(Hannover) 박람회는 금융 질서 못지않은 실물 경제에서의 구조 변동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독일은 '산업(Industry) 4.0'을 국책으로 삼고 있다. 증기 기관, 공장식 대량 생산, 전자 통신 이후의 네 번째 산업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공장에 적용하여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한다. 이 정책을 처음 발표한 자리도 2013년 하노버 박람회였다. 그리고 올해 합작 파트너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다. 약 600여개의 중국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박람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라는 계획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역시 산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이 골자이다.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3D 프린팅 등 다방면에서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했다. 추임새를 넣은 것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다. 초청 강연에서 본인이 제창했던 '제3차 산업 혁명'의 주역으로 독일과 중국의 합작을 치켜세웠다. 양국의 주도 아래 사물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의 혁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미 빛 전망을 제시했다.
2014년 3월 시진핑 주석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전방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리커창 총리는 취임 후 연거푸 독일을 찾아 '산업 4.0'을 공동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110개나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이 포함되었다. 벌써 중-독 표준화 위원회도 설립되었다.
21세기 제조업의 표준을 선도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중국은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선물로 노반쇄(魯班鎖)를 선사했다. 중국의 고대 발명가인 노반이 창안하고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자물쇠 퍼즐이다. 한국서는 흔히 공명쇄(孔明鎖)라고 불린다. 짝퉁으로 출발했던 중국 제조업이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역사 속 아이콘으로 환기시킨 것이다. 과연 인류의 3대 발명품, 종이, 화약, 나침반은 모두 중국산이었다.
독일의 회심 또한 합리적이다. 독일은 GDP의 50%를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1990년 통일 당시의 24%에 견주자면, 수출이 차지하는 몫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로 유럽 시장은 작고 좁다. 글로벌 시장 확대가 관건이다. 결제 장부 목록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유럽이 차지하는 몫은 40%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점점 줄고 있다.
비중이 늘어나는 곳은 단연 아시아다. 실질적으로 독일은 유로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고쳐 말해 '유라시아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유럽 최초의 위안화 결제 기관이 분데스방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낙점되었음도 우연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유라시아를 향해 독일이, 또 유럽이 東進(동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실크로드(Seidenstrasse)'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도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이었다.
신 동방 무역 시대
영국의 산업 혁명은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시작이었다. 지하(地下) 자원을 앞서 활용함으로써 지상(地上) 자원에 의존하던 유라시아 제국들을 침몰시켜갔다. 서구의 굴기 속에 오만과 편견도 무럭무럭 자라났다. 셰익스피어를 인도 전체와 바꾸지 않겠다는 허풍이 버젓이 통용되었다.
그 영국의 의사당에 간디의 동상이 세워졌다. 역시 지난 3월이다. 20세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가 식민모국의 중심,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우뚝 자리한 것이다. 영국식 과거사 청산이라 하겠다. 금전적 배상은 하지 않았다. 실질 구매력에서 인도는 이미 영국을 앞질렀다. 캐머런 수상보다 모디(Modi) 총리의 말에 힘이 실리는 시대이다.
하여 대영제국은 하얗게 잊어도 좋겠다. 그보다는 동인도회사를 공부하는 편이 한층 유익할 것이다. 그럼에도 셰익스피어만큼은 계속 읽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1600년 초판이 나왔던 <베니스의 상인>을 추천한다. 당시 지중해의 풍경이야말로 21세기 유럽의 미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동방 무역으로의 회귀, 신 동방 무역 시대의 개창이다.
AIIB의 본부는 베이징에 자리할 것이다. 상하이에는 브릭스 개발은행이 들어설 것이다. 양대 은행을 축으로 전 지구적 금융 질서의 판도가 새로이 그려질 것이다. 중국은 올해 안에 모든 형태의 무역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의 세기'는 예상을 거듭 앞질러 훨씬 일찍 도래하고 있다. 상하이의 푸동(浦东)에는 '東方明珠(동방명주)'가 빛을 낸다. 신 동방무역 시대의 상징물이 제국주의의 흔적인 와이탄(外灘)의 옛 조계(租界)를 굽어보며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다짐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대반전(Great Re-volution)의 세기이다.
반전 시대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반동파도 여전하다.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거부하고 구상태를 고수하며 신냉전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다. 그 최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자리한다. 유라시아의 재통합과 분열/분단이 길항하는 첨예한 현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1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유라시아 견문] 우크라이나 : 신냉전과 탈냉전
'나치의 후예'들이 '민주주의 투사'로 둔갑하다
신냉전 : 역사의 반복
우크라이나를 살피노라면 기시감이 거듭 인다. 20세기의 온갖 積弊(적폐)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경제는 수렁이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은 7.5% 감소하고 물가는 20% 상승했다. 정치 불안으로 해외 투자도 대폭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허나 IMF 개입이 독배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쇼크 독트린', 재난 자본주의가 재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IMF는 언제나 선봉대였다. 1970년대 남미부터 1990년대 동아시아까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다. 새천년에는 아일랜드와 그리스를 '부채 식민지(Debt Colony)'로 만들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새 영토로 삼았다. 의례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 조항이 눈에 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번째 옥수수 수출국이자 5번째 밀 수출국이다. 비옥한 흑토 덕에 천혜의 곡창 지대를 가졌다. 그 풍요로운 국부의 원천이 생명공학 기업들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승자는 예상 가능하듯, 몬샌토와 듀퐁이다. 2014년 이후 몬샌토는 14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투자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착착 진행됨으로써 농경지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었다.
쿠데타로 쫓겨난 전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가 결사코 막고자 했던 사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를 '세계화의 덫'에 빠트리고, 농업 기반을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삽시간에 전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실상은 엉뚱하게 알려지고 있다. 비난의 표적은 IMF가 아니라 러시아와 푸틴이다. 서방의 오래된 기만책이 기막히게 먹혀들었다. 매체를 동원한 여론 조작이다. 크림 반도의 러시아 합병은 그곳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착시가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
그만큼 서방은 선전 선동에 능란하다.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또한 결코 낯선 풍경만은 아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 이라크를 침략하고 석유지대를 탈취했던 예전의 악습과 상통한다.
선전 선동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기승이다. 러시아를 공산주의에 빗대는 시대착오가 만연하다. 곧 전면적 반공주의를 관철시키는 새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기관은 이미 공산당 당수 표트르 시모넨코(Pyotr Symonenko)를 체포했다. 이유가 가관이다. 러시아를 방문해 TV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악취가 풍긴다.
이쯤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한 유로마이단 운동의 기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70년을 거슬러 오른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망했다.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나치를 추종하는 일군의 무리가 남았다. 소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연합(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OUN)이다. 이들은 패전 후에도 소련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1949년,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자, 해외로 거점을 옮겨 우크라이나 '해방'을 위해 전복 활동을 계속했다.
서방, 특히 미국은 이 조직을 적극 활용했다. 지도자 미콜라 레베드(Mykola Lebed)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나치 협력의 이력은 문제 삼지 않았다. 소련에 맞설 냉전의 전사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연구 기관과 출판사를 차려주었다. 반공, 반소적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도록 물심으로 지원했다. 라디오 방송을 하고, 반공 강연을 다니고, 신문과 책을 발행했다. 이른바 '문화 냉전'의 전위였다.
이처럼 OUN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수십 년간 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고취해왔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역사도 교묘히 고쳐 썼다. 반소/반공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면으로 친나치 전쟁 범죄의 흔적은 슬며시 지워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이들이 대거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망명자들이 집필한 역사 교과서도 우크라이나로 반입되었다. 나치즘에서 배양되고 미국에서 숙성되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고스란히 전파된 것이다.
이들은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민주화'의 허울 아래 세(勢)를 더욱 키워갔다. 그리고 10년 만에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몰아내는 민간 쿠데타에 성공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친나치 시절의 반러시아, 반유태주의를 재차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다. 러시아인과 유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상대로 내전을 추동하고 있다. 전체주의와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20세기의 병폐가 집약되었다.
멀찍이서 흡족한 나라는 미국이다. 유럽과 러시아를 다시 갈라 침으로써(Devide and Rule) 유라시아의 재통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더욱 끌어들일 태세이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소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체제 전환'을 도모한다.
러시아의 소위 '자유주의'적 반체제 인사들은 이 大局(대국)을 좀체 간파하지 못한다. '민주 대 독재'라는 흘러간 노래만 부른다. 지금 푸틴이 물러서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게 된다. 자국의 자원은 헐값에 넘어가고, 중앙아시아마저 덤으로 바치는 꼴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KGB에서 잔뼈가 굵은 푸틴은 좀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왕년의 얼치기 자유주의자 옐친처럼 어리숙하지 않다. 이미 민스크(Minsk)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AP=연합뉴스
탈냉전 : 역사의 반전
푸틴과 보조를 맞춘 이는 독일의 강골, 메르켈이다. 그녀도 미국의 흑심을 좌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여 군사적 개입을 도모하는 호전책을 방관할 수 없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시작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교전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제3차 세계 대전의 양상이다.
게다가 미국은 NATO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참전할 것이다. 고쳐 말해 독일마저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최악의 위기였다. 하여 수작을 부리기 전에 선수를 쳤다. 서둘러 모스크바와 키에프로 날아간 까닭이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주앉아 중지를 모아냈다. 물론 민스크 협정은 미봉책이다. 하더라도 상징성은 대단하다. 미국을 배제함으로써 동유럽의 정전과 안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은 점점 더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여 러시아가 서방의 봉쇄로 고립되어 있다는 진단 또한 좀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서나 통하는 그릇된 통념이다. 오히려 푸틴이 독일에 제안했던 대유럽(Greater Europe) 구상에 대한 호감이 갈수록 늘고 있다.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유라시아 고속철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독일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시장을 커다랗게, 또 촘촘하게 엮어내는 것이다. 이 솔깃한 구상을 독일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러시아는 도리어 전 방위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올 여름 큰 결실을 맺는다. 브릭스(BRICs) 정상 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동시에 주최하기 때문이다. 다극화 세계의 교두보인 브릭스는 올해 말 개발 은행을 출범시킨다. 세계 인구의 5분의 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선보인다.
SCO 역시 확대일로이다. 곧 남아시아의 대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한다. 여기에 서아시아의 터키 또한 SCO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거듭된 구애에도 유럽연합(EU) 가입이 좌절되었다. 이슬람 국가라는 점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SCO는 종교와 문명이 다르다고 타박하지 않는다. 올 초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 구입을 결정함으로써 터키 또한 유라시아로의 노선 변경을 본격화했다.
畵龍點睛(화룡정점)은 이란이 찍을 듯하다. 핵 합의가 타결됨으로써 국제 제제를 받고 있는 국가는 가입을 보류하는 SCO 헌장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곧장 이란과 파키스탄을 잇는 천연가스 연결망 사업을 발표했다. 테헤란과 이슬라마바드가 베이징과 한 줄로 엮여든다. 7월 정상 회담에서 이란이 SCO의 정식 회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치푸라스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 그리스의 돌파구를 여는 장면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두 사람은 양국이 공유하는 동방 기독교의 전통을 회고하고, 나치즘에 함께 맞섰던 제2차 세계 대전의 기억을 나누었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는 방콕을 방문 중이었고,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군사 회담을 하고 있었다. 또 베트남은 1월에 닿을 올린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유라시아의 재통합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좌/우를 가르지도 않고, 민주/독재를 가리지도 않는 大同(대동)세계의 새 물결(New Wave)이다.
New World와 New Age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통해 미국이 꾀하는 것은 유라시아의 三分(삼분)이다. 유럽, 러시아, 중국을 나누고 쪼개는 것이다. 러시아는 NATO로 견제하고, 중국은 한-미-일 연합으로 봉쇄한다. 전자가 환대서양 동맹이고, 후자가 환태평양 동맹이다. 냉전기의 패권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 없는 반복은 반동적이다. 실로 대서양은 19세기가, 태평양은 20세기가 절정이었다. 어느덧 신세계(New World)야말로 구체제(Ancien Régime)가 되고 있다. 역사는 늘 그렇듯, 돌고 또 돌아간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터키 등은 하나같이 유라시아의 고전 문명을 계승하는 유구한 나라들이다. 21세기의 '신형 대국관계' 또한 이들로부터 도출되지 싶다. 오래된 세계를 갱신함으로써 더 멋진 신세계, 新天地(신천지)를 일구는데 의기투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만이 특별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슬람권은 향신로(Spice Route)를 재발견하고 있고, 인도는 면화길(Cotton Route)을 주목하고 있다. 유라시아를 가로질렀던 누들 로드(Noodle Road) 또한 빠트릴 수 없겠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막다른 곳에서 비단길과 향신길과 면화길과 국수길이 다시 만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생생한 再生(재생)과 還生(환생)의 현장들을 차근차근 밟아갈 것이다. 우선 인도양의 바닷바람부터 가볍게 쐬어보기로 한다. 興(흥)을 돋구는 배경음악으로는 뉴에이지(New Age)가 딱-이겠다.
[유라시아 견문] 인도양에 부는 바람
장보고와 신드바드, 사실은 술친구였다?!
비단길과 면화길
인도양에도 대륙풍이 거세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의 남진(南進)이 破竹之勢(파죽지세)이다. 특히 스리랑카, 몰디브, 모리셔스(Mauritius), 세이셸(Seychelles) 등, 도서 국가들이 거점이다. 언뜻 하와이, 괌, 필리핀, 오키나와를 발판으로 태평양에 진출했던 20세기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 날개로 비상했다. 중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양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으뜸은 스리랑카이다. 중국이 콜롬보와 함반토타(Hambantota) 항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0대 항만 가운데 7개 항만을 보유한 해양 대국이다. 콜롬보와 함반토타 모두 '남아시아의 싱가포르'에 빗댈 만한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콜롬보, 갈레(Galle), 마타라(Matara)를 잇는 연안 도시 고속도로도 만들어주고 있다.
몰디브도 못지않다. 2013년 11월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정부 출범 이래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이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친히 방문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의 행차였다. 관광, 건설, 해양의 3대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구공항은 보수하고 신공항도 세운단다. 수도 말레(Male)와 국제공항이 자리한 훌후레(Hulhule)를 잇는 다리도 짓고 있다. 몰디브의 바다길, 육지길, 하늘 길을 모두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세이셸에도 정성이다. 위치가 중요하다. 인도의 서쪽은 아프리카의 동편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과 에너지가 목마르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동해안이 잔잔하지 못하다. 수시로 해적이 출몰한다. 2011년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 이후 중국 해군이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있다. 그들의 중간 연료 주입지로 낙착된 곳이 바로 세이셸이다.
실은 콜롬보 항에도 중국의 잠수함이 등장하여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 여파로 올 1월 대선에서 스리랑카의 정권이 교체되었을 정도이다. 중국의 투자 덕에 연 7%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중국 편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스리랑카 신정부는 한때 중국과의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결국 계속 시행으로 귀착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화였다.
그리하여 '재균형'의 축으로 호출된 나라가 인도이다. '인도양'은 말 그대로 인도의 텃밭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월 11일부터 스리랑카, 세이셸, 모리셔스를 잇달아 순방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웃부터 챙긴다는(Neighbourhood-First) 안성맞춤의 구호도 내세웠다. 순방 이후에는 인도의 동부 도시 부나네스와르(Bhubaneswar)에서 대규모 국제 회의도 주최했다. 'Indian Ocean : Renewing the Maritime Trade and Civilisational Linkages'를 주제로 인도양 9개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선언된 것이 '면화길(Cotton Route)'의 복원이다. 중국의 비단길 공세에 인도는 면화길로 응수한 것이다.
면화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향하는 통로가 필요하다. 아시아의 거점으로는 이란이 꼽힌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와 함께 이란을 통하여 양국을 잇는 남북회랑을 구상 중이다. 인도의 뭄바이 항에서 선착한 화물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를 통과하고 카스피 해를 지나 러시아의 아스트라한(Astrakhan) 항에 도착하는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이란의 차바하르( Chabahar) 항을 통해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접속하고, 더 나아가 터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도판 유라시아 구상에 이란이 관건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거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남아공은 이미 브릭스의 일원으로 돈독하다. 또 인도양에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산재한다. 그 중에서도 간디도 머물렀던 남아공에 특히 많다. 華僑(화교)가 비단길의 촉진자 역할을 하듯이, 2500만 印僑(인교)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를 잇는 면화길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집트에서 남아공까지 동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연결망을 인교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축한다는 야심한 계획도 세워두었다.
아세안도 빠뜨릴 수 없겠다. 북으로는 미얀마의 시트웨(Sittwe) 항 건설을 돕고 있다. 벵골 만을 통하여 인도의 동북부와 아세안을 잇겠다는 뜻이다. 미얀마까지 가닿는 고속도로도 건설하여 동남아를 종횡하는 아세안 고속도로(ASEAN Highway)와도 접속할 계획이다. 남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중요하다.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명실상부 아세안 최대 국가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수마트라와 자바가 모두 인도양에 자리한다.
4월 22일 공식 취임한 인도 최초의 아세안 대사 또한 자카르타를 첫 부임지로 삼아 인도네시아를 예우했다. 기실 인도는 동남아의 기층문화를 일군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불교와 힌두교에 이슬람까지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儒彿道(유불도)의 중국에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매력이고 자산이다. 인도 역시 또 하나의 문명 국가(Civilization-State)인 것이다.
다만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가 복병이다. 갈대 같은 민심은 모디 정권 출범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지방 선거에서 야당으로 돌아섰다.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권의 노선은 일단 뒤집고 보는 것이 작금 민주주의의 병폐이다. 모처럼의 면화길 선언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는지 가늠하기 힘든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十年之計(십년지계)를 세우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중국에 비하자면, 인도의 거너번스는 아무래도 어수선하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추세는 낙관적이다. 일국의 政勢(정세)가 유라시아 르네상스라는 세계사의 大勢(대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향보다는 속도이겠다.

▲ 해상왕 장보고와 아라비아 상인 신드바드가 밤새 찻잔이나 술잔을 기울이며 친교를 나눴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자. 한국방송(KBS) 드라마 <해신>의 장보고와 영국 드라마 <신드바드>의 신드바드. ⓒ프레시안
신드바드와 장보고
모디 총리는 '청색 경제(Blue Economy)'도 제창했다. 인도양의 해양 경제에 바탕을 둔 청색 혁명(Blue Revolution)을 표방한 것이다. 인도의 국기 한 복판에는 스물네 갈래로 뻗어가는 파란색의 法輪(법륜)이 자리한다. 실로 인도는 동아프리카,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 아덴만,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 벵골만,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잇는 광활한 바다의 한 가운데 자리한다. 인도양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기후 변화와 각종 재난에 공동 대처하는 운명 공동체(Indian Ocean Community)임을 선언한 것이다.
새삼 이를 일깨워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10여 년 전 수마트라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이다. 17만 명을 헤아리는 막대한 희생자 가운데는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사람도 160명이 있었다. 쓰나미가 일어난 날은 2004년 12월 26일. 해일은 겨울 계절풍을 타고 2005년 1월 동아프리카까지 가닿았던 것이다. 인도양은 바람과 파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였다.
인도양 세계는 몬순 계절풍의 산물이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인도양 동북부(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만, 인도 아대륙)에서 동아프리카 해안(소말리아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으로 건조하고 더운 북동 계절풍이 분다. 4월부터 6월까지는 폭풍과 장마가 잦다. 7월이 되어야 하늘이 걷히고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 인도양 서부에서 동부를 향해 여름 계절풍이 부는 것이다.
항해사와 상인들은 이 몬순의 순환을 따라서 인도양을 하나의 생활 세계로 만들어갔다. 동서의 문화 전파와 인구 이동을 매개했던 것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발견과 정복의 거친 바다였다면, 인도양은 교류하고 소통하는 세련된 코스모폴리탄 세계였다. 그 인도양 세계의 보편어는 아랍어였고, 그 물길과 말길을 따라서 알라와 무함마드의 말씀도 널리널리 퍼져나갔다.
그래서 인도양 세계의 출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슬람이 약진했던 8~9세기로 거슬러 오른다. 아랍과 페르시아의 상선들이 인도양을 순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정크선도 동남아로 진출하여 이슬람 상인들과 합류했다. 페르시아와 남중국을 잇는 바닷길이 천 년 전에 완성된 것이다.
이로써 탄생한 여행서사가 바로 <신드바드의 모험>이다. 신드바드는 바그다드 출신 상인이었다. 동양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이라크의 바스라 항을 떠나 인도양으로 향했다. 南(남)으로는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타르까지, 東(동)으로는 말레이와 자바까지 가닿았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계절풍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거친 풍랑을 만나 무인도와 낯선 섬을 전전하며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는다. 그러다 끝내 사란디브, 오늘의 스리랑카에 도착해 보물을 발견한다. 각종 보석과 상아를 수입하여 대부호가 된 것이다. 물론 소설이다. 하더라도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니다. 오히려 9~10세기, 인도양 세계를 누볐던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의 생활상을 생동감 넘치게 전하는 리얼리즘에 가깝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중국의 광저우(廣州)였다. 그래서 광저우에는 이슬람 상인의 대규모 거류지였던 번방(番坊)이 있었고 모스크도 여럿이었다. 호기심 왕성한 일부는 중국 연해를 따라 북상했다. 복건성의 천주(泉州)나 장강 하구의 양주(扬州)에도 거류지가 생겨났다. 우리로서도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신라방이 자리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즉, 천주와 양주는 동아시아 교역권과 남아시아 교역권을 잇는 연결점(nod)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교역권을 주름잡았던 인물이 바로 海上王(해상왕) 장보고였다. 즉, 신드바드와 장보고는 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찻잔을 기울이고 실론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을지 모른다. 엉뚱한 과장만도 아니다. 신드바드란 페르시아어로 '힌바드', 즉 '인도의 바람'이란 뜻이다.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항해했던 바닷사람들의 총칭인 것이다. 이슬람과 한반도의 바닷사람들이 조우하여 천일야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그네들의 세계는 넓고도 가까웠다.
인도양 세계의 전성기는 13세기였다. 몽골세계제국이 중화 세계의 경제력과 이슬람 세계의 상업망을 커다랗게 통합했다. 대륙의 초원길과 해양의 바닷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유라시아의 대동맥이 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13세기 세계 체제'라고도 부른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로 작동하는 근대 세계 체제와는 일선을 긋는 공존과 관용으로 작동하는 다중심적 세계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13세기 세계 체제'의 실체를 규명할 것까지는 없겠다. 오히려 근대 세계 체제의 기원을 16세기 지중해에서 구하는 기왕의 독법을 수정하는 편이 낫겠다. 지중해가 외따로 존재하여 자가 발전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중해는 인도양의 물결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끝물에 자리했다. 그래서 바스코 다 가마도 콜럼버스도 그토록 인도로, 인도양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다. 지중해-인도양의 관계 양상이 지중해-대서양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수탈 방식으로 전환된 것도 19세기에서야 전면화 되었다. 그 전에는 그저 장사하고 무역하는 동인도'회사'에 그쳤을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증기선과 함포로 중무장한 전함들이 진군함으로써 정크선과 다우선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러자 '자유 무역'이 번창했다. 바람과 파도에 순응하고 팔다리의 근력에 의존했던 '자연 무역' 대신에 석탄과 석유를 떼어 해류를 거스르는 '자유 무역'이 이식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결코 자유롭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았다. 소금, 목재, 면화, 비단, 도자기, 보석 등 '보이지 않는 손'의 비교 우위에 기반을 둔 천년의 교역 망이 왜곡되고 굴절되었다.
고무와 사탕수수, 아편을 단작 경영하는 플랜테이션도 확산되었다. 인도양 사회만큼이나 생태와 식생 또한 식민화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인들이 주도했던 말랑말랑하고 물렁물렁했던 유기적이고 액체적인 세계가 군인들이 앞장서는 딱딱하고 단단한 기계적 세계(=국가 간 체제)로 경직화되어 갔다.
본디 바다에는 산과 강처럼 대지를 가르는 자연적 경계가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영해'(領海)라는 관념과 국제법을 들이밀며 바다 역시 육지화하고, 영토화하고, 군사화 되었다. 이러한 전환을 두고 20세기에는 '문명화'라거나 '근대화'라며 높이 떠받들었다. 그 가당찮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 표준적 지식과 이론으로 군림함으로써 천 년 간 유라시아의 허브로 약동했던 인도양 세계 또한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망각되었던 것이다. 인도양도 100년이나 고독했다.
역풍과 순풍
딱딱하게 굳어진 세계가 쉬이 풀리지는 않았다. 간디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체제가 아대륙에서도 복제되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분단되었고, 방글라데시마저 떨어져 나갔다. 영국 식민주의의 반작용으로 민족주의가 세계주의를 대체했다. 특히 인도는 간디식 자급/자립주의와 네루식 일국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제3세계에 자족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생산 및 유통, 소비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중화 세계를 회복해갔던 것에 비하여, 남아시아는 여전히 재통합과 재융합이 더디고 무딘 편이다.
그럼에도 지구는 돌고, 계절은 순환하고, 바람도 방향이 바뀐다. 인도서도 변화의 바람, 반전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도가 모삼 프로젝트(Project Mausam)를 공식화한 것은 2014년 중반이었다. 중국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표방하고 1년 후였다. 모삼은 몬순(Monsoon)의 힌두식 발음이다.
몬순 계절풍에 기댄 고전적 교역망을 재건함으로써 인도양 세계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중앙 정부의 방침에 가장 기민하게 호응하고 있는 곳은 남서부의 케랄라(Kerala) 주이다. 벌써 주 정부 차원에서 왕년의 향신로를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 동아프리카에 가닿는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인도양 세계서도 재차 活氣(활기)가 넘쳐나고 活力(활력)이 솟아난다.
물론 비단길과 면화길의 충돌을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국제관계학 이론을 빙자하여 은근슬쩍 아시아 양 대국의 이간질을 꾀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친디아(CHINDIA)의 시너지 효과에 낙관적인 편이다. 모자란 것은 보태고, 남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중국은 자본이 넘쳐나지만 노동력이 줄고 있다. 인도는 자본은 부족한데 인력은 넉넉하다.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또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 대국이고, 지금 인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프라 재건이다. 상부상조(win-win) 할 수 있다. 유라시아의 대국적 견지에서도 양국의 협동은 중차대하다. 오늘의 G2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내일의 G2는 중국과 인도이기 때문이다. 하여 5월로 예정된 모디와 시진핑의 만남은 2015년 가장 중요한 양자 회담이라 하겠다. '中印大同'(중인대동)이야말로 太平天下(태평천하)의 주춧돌이 될 신형 대국 관계이기 때문이다.
막연한 소망만은 아니다. 근거 없는 억측도 아니다. 엄연하게 역사에 기초한 나름의 전망이다. 신중국과 신인도는 '평화 공존'에 충성할 것을 굳게 맹세한 바 있다. 60년 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였다. 네루와 저우언라이, 나세르와 수카르노 등 아시아-아프리카의 거인들이 집결한 획기적인 모임이었다. 돌아보면 인도양 세계를 재건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인도양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인도네시아가 괜히 주최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남남(南-南)연대를 조숙하게 다짐함으로써 새 천년의 세계질서를 준비하는 기원이었다고도 하겠다. 백년의 逆風(역풍)을 천년 順風(순풍)으로 되돌리는 '장기 21세기'의 발원지였던 것이다. 이만하면 반둥으로, 자카르타로, 인도네시아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유라시아 견문] 인도네시아 : 적도의 대국
'적도의 잠룡' 인도네시아, 기지개를 켜다!
상상의 공동체
인도네시아는 '상상의 공동체'였다. 20세기 중반에야 세워진 '인공 국가'이다.
194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없었다. 적도의 아래위로 산재한 섬들의 군집이 있었을 뿐이다. 자바와 수마트라처럼 인구가 많은 섬도 있었고, 파도만 부서지는 바위섬도 있었다. 영해를 포함하면 인도네시아의 크기는 중국이나 미국의 영토에 필적할 만큼 광활하다. 그 너른 마당에 200여 개의 종족 문화와 언어 집단이 널리 산포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으로 정치적 통일성을 부여한 경험은 길게는 300년, 짧게는 30년에 달하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가 민족주의를 촉발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 월남, 시암, 버마 등 내륙형 중앙 집권 국가의 경험이 부재했던 인도네시아로서는 민족주의에 동원할 역사도 전통도 부박했다. 종교와 친족, 상업망이 느슨하게 교차하는 '만달라 국가'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독립 국가의 상상력에 불을 붙인 계기는 1942년 대일본 제국의 점령이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 이후 동남아로 진격했다.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말레이 반도의 영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마저 격파했다. 제국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반서구 아시아의 이념을 제공했다. 뿐 아니라 네덜란드 식민 통치 기구를 물리적으로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수마트라는 육군 25사단, 자바는 16사단이 장악했고, 동부의 작은 섬들은 해군이 점령했다. 이들은 각각 싱가포르에 직속되었고, 싱가포르는 사이공의 예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도쿄에 복속되었다. 대동아 공영권에 편입된 것이다. 자바의 표준시도 도쿄에 맞추어졌다. 자바의 수도가 바타비아에서 자카르타로 바뀐 것도 이 때이다. 네덜란드식 거리 명칭도 모조리 변경되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인도네시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근대적인 군사 훈련도 받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현지인 장교를 전혀 양성하지 않았다. 반면 제국 일본은 현지 군인을 적극 배양했다. 대동아 아래서 장차 '인도네시아 국군'이 자라난 것이다. 이 과정을 관료로서 경험한 이가 아크멧 수카르노(1901~1970년)였다. 일종의 '수습 기간'이었다.
수카르노는 1945년 건국 헌법에서부터 인도네시아의 도덕적 책무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운 세계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표방했다. 1955년 반둥 회의가 괜히 열렸던 것이 아니다. 또 이 자리에 아시아-아프리카 가운데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초대된 것도 우연만은 아니었다.
실로 1960년대의 인도네시아는 1940년대의 일본과 흡사했다. 신세계 질서를 표방하며 영미(英美)와 일전을 불사했다. 수카르노는 올림픽을 대체하는 가네포(GANEFO)를 주도했고, 국제연합(UN)을 대신하는 코네포(CONEFO)까지 추진했다. 동북아에 자리한 일본이 대동아에 그쳤다면, 동남아에 자리한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더 큰 포부를 품었다.
그래서 건국 이념이었던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 또한 국내적인 동시에 국제적인 발언이었다. 인도네시아라는 '상상의 공동체'부터가 이미 수많은 종족/민족과 다양한 종교/문화로 이루어진 '작은 아시아-아프리카'였다. 즉 범아시아-아프리카주의와 범인도네시아주의는 공진화했던 것이다.
허언만도 아니었다. 2억4000만 인구 가운데 1억3000만이 사는 자바 문화가 인도네시아 문화를 대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자바어가 아니라 말레이어의 일종을 나랏말로 선택했다. 인도양 동부의 보편어를 국어로 채택함으로써 자바 패권주의를 억제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와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는 오로지 말레이 계통의 표준어만 허용된다.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이면서도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지 않았다. 15세기부터 이슬람이 약진하기 전까지 적도의 섬들에는 불교와 힌두교가 중요했다. 발리는 여전히 힌두 문화의 처소이며, 곳곳에 중국식 사원과 성당, 교회도 여럿이다. 신정(神政) 국가 대신에 세속 정부를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과 개방성은 인도와 중국은 물론이요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와도 교류했던 천 년 역사의 소산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두 세대에 걸친 '국민 교육'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수카르노는 좌로 기울고, 수하르토(1921~2008년)는 우를 선택했다는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있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를 상상의 영역에서 실제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동의 공로자였다.
새천년 인도네시아는 세계 10위의 국내 총생산(GDP)을 확보하며 G20(주요 20개국)의 일원이 되었다. 매킨지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이면 세계 7위 국가로 부상한다. 브릭스(BRICs)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망을 덜 받고 있지만, 21세기를 주도할 신흥 국가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과연 규모는 관건적이다. 세계 4대 인구 대국이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며, 아세안의 최대 국가이자, 세계 3대 민주주의 국가이다. 갈수록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실도 만만찮다. '상상의 공동체'였기에 더욱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만의 오랜 역사, 독자성, 정체성을 일방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코즈모폴리턴 문화가 곧 토착 문화라는 역설이야말로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 맞는 최적의 자산이 되고 있다.

▲ 라이잘 쿠크마 인도네시아 국제관계전략센터 소장. ⓒ이병한
'인도-태평양' : 역동적 균형자
라이잘 쿠크마(Rizal Kukma)를 만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가 열린 다음날 오후였다. 역사 박물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바타비아 카페'에서였다. 역사 박물관은 옛 네덜란드 식민지 총독부를 개조한 곳이다. 이제는 붉고 하얀 인도네시아 깃발이 바타비아 광장에 펄럭이고 있었다.
쿠크마는 국제관계전략센터 소장으로, 100대 '글로벌 싱커(Thinker)'로 꼽힌 적도 있는 명망가이다.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 선행 학습으로 읽었던 여러 논문과 저서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던 인물이다. 현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를 자문하는 핵심 책사로 꼽히기도 한다.
한 교민의 표현을 빌면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노무현'에 가까웠다. 자그마한 도시의 시장을 역임하다가 자카르타 주지사를 짧게 거치고 곧바로 대통령까지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서민의 대변자' 이미지가 크다. 반면에 국제 사회 경험은 부족했다. 국제주의자를 자처했던 전임자 밤방 유도요노(Bambang Youdhoyono)에 견주어 외교력의 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교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킨 것이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 개막 연설이었다. 국제 사회의 데뷔 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세운 것이다. 발전도상국의 대변자이자 이슬람 세계의 중재자로서 신정부의 외교 청사진을 명료하게 밝혔다. 신흥국들이 제 몫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창출을 선언하며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을 촉구하는 대목도 화제를 모았다. 얼핏 수카르노의 재림처럼도 보였다. 이 개막 연설의 준비 과정에도 깊이 개입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쿠크마였다.
그는 '포스트 아세안'의 주창자로 유명하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역' 개념은 이미 동남아와 아세안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해양을 잇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를 자리매김한 것이다. '협력의 지정학',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 등과 같은 선도적인 개념을 제출하며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Norm Setter)을 지향하고 있다.
역동적 균형이란 무엇인가? 인도태평양의 4대 대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언뜻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떠오른다. 동북아에도 4대 대국이 있다. 그럼에도 흔히 사용되는 'Balance'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음이 눈에 띈다. 기존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과는 다른 발상인 것일까?
그는 'balance'를 쓰지 않는 이유를 군사 동맹이나 군비 경쟁을 통한 군사력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악순환의 재균형'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냉전기부터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SEATO) 가입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지역 문제의 지역적 해결'을 추구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브뤼셀과 같은 특정한 중심이 없는 아세안형 조직 구성도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컸다. 회원국들이 해마다 순회하며 중심 역할을 번갈아 맡는데 주도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가운데 유일한 G20 국가라며, 아세안에서 실현한 '협력의 지정학' 모델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역동적 균형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책무라고 말했다.
기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외교 무대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다. 반둥 회의와 비동맹 회의 등 수카르노가 남겨준 역사적 유산에 가깝다. 다만 수카르노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곤란하겠다. 수카르노는 서구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제3세계의 전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작 내치에 실패하고 말았다. 수하르토의 쿠데타로 내부로부터 좌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여 조코위 정부는 내치와 외교의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조코위의 신세계 질서와 시진핑의 신형 국제 관계가 궁합이 맞아떨어진다. 인도네시아가 두 대륙과 두 해양을 잇는 연결망의 축(Global maritime axis)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건설 투자가 절실하다. 조코위는 집권 청사진으로 인도네시아 섬들 간의 연결망을 확충해서 교육과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표방했었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물론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인프라 건설이 긴요한 것이다. 바로 그 시점에 중국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호기가 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 일찌감치 창립국 가입을 선언했다. 조코위 정부 출범 두 달만의 신속한 결단이었다.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친중 노선을 표방하나?" 개막 연설 직후부터 현장서는 말이 많았다. 또 그 전부터 들은 얘기도 있었다.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는 1971년 창립부터 화교 자본이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저서 가운데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단독 주제로 삼은 책도 있다. 그러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NO!"
인도네시아는 특정 국가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의 '환태평양'(Trans-Pacific)에 끌려가지 않는 것만큼이나, 태평양을 '중화의 바다'로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한 것이 '인도태평양'이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독주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허브는 특정 강대국이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균형자' 역할을 했듯이,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의 '역동적 균형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아세안이 허브(Hub)이고, 미국, 중국, 일본, 인도가 스포크(Spoke)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지구적 수준에서는 비동맹을 고수하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아세안의 심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부국강병을 추구하기보다는 역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중재자 역할에 치중했다. 그래서 아세안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존중받는 '형' 대접을 받고 있다.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G20에서도 공헌할 작정이다.
그는 G20은 G7과 같은 선진국 클럽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둥 회의 참가국이었던 중국과 인도, 사우디와 터키,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다. 문명 간 연합을 추동하는 다문명 지구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G20에서 '문명 간 가교자'로서 한층 균형 잡힌 세계 질서에 공헌할 것이라고 한다. 하얀 치아가 환하게 드러나는 웃음만큼, 그는 자신만만하고 야심만만해 보였다.

▲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 중 이슬람 국가 대표와 반둥 시민이 따로 모여 모스크에서 가진 합동 기도회.
이슬람 르네상스
세계 질서의 재균형이라는 과제에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내심으로 공명하고 있다면, 양국이 갈리는 지점에는 문명과 문화가 자리한다. 인도태평양이 새로운 지리-정치학적 발상의 제출이라면, 지리-문화 혹은 지리-문명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의 중흥을 꾀하고 있다.
반둥 현장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중앙 모스크에서의 합동 기도회였다. 이슬람 국가 대표들과 반둥 시민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의 행사를 치른 것이다. 여기서는 세속적 국가의 수반들이 아니라 이슬람 학자, 울라마(Ulama)가 주역이었다. 울라마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지평에서 무슬림 형제들을 하나로 잇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한 시간의 기도회에서 오고간 설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간간이 '아시아-아프리카', '반둥', '알라', '무함마드', '팔레스타인', '이슬람' 등의 단어들이 들려왔을 뿐이다. 실제로 이번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의 3대 의제 가운데 하나가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선도적 조취로 자카르타에 임시 영사관도 설치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 속에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면서 민주화로 이행했다. 몇 차례의 대선과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체제 이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민주화'로 촉발된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이슬람의 부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수하르토 시절만 해도 차도르를 걸치고 다니는 여성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 도리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5년 4월, 자카르타와 반둥 곳곳에서 화려한 색깔의 차도르로 한껏 치장한 여성들이 '아이폰6'를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숱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
기실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부터가 메카 순례를 다녀왔던 독실한 신도였다. 그래서 이름 또한 '아흐마드' 수카르노(Ahmad Sukarno)였다. '아흐마드'는 이슬람 인으로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상징했다.
('아흐마드(Ahmad)'는 아라비아 어로 '가장 찬양할 만한'이라는 뜻이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마호메트)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랍권에서는 대중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은 '아크멧 수카르노'다.)
아랍의 신생 국가들 또한 수카르노에 기대가 컸다. 반둥 회의를 성공시킨 정치적 역량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하르토의 쿠데타로 미국과 결탁하는 서구 지향으로 굴절되었다. 그러다 '민주화'의 물결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정체성 및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제가 제출되었고, 재차 이슬람 부흥(Pembaruan) 운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 바타비아 광장. ⓒ이병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슬람 부흥 운동이 사회운동과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NGO가 대약진하고 있다. 종교와 학교와 시민 단체가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급진적 무슬림 여성주의자로 명성이 높은 릿팟 하산(Riffat Hassan)의 강연을 이슬람 사원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만큼 풀뿌리에서 이슬람 여성주의, 이슬람 환경주의, 이슬람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한 것이다. 국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슬람 연구소(State Islamic Institute)을 만들어서 '계몽적 이슬람' 관료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슬람 계몽주의의 부활을 예감케 한다.
그래서 중동의 혼돈과 이슬람 급진주의에 견주어 인도네시아의 세속적 이슬람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2억2000만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그 규모에 비해 영향력이 덜했다. 종가가 아닌 변방이었기 때문이다. 메카나 카이로에서 공부한 유학파 울라마들이 줄곧 우대를 받아왔다. 지금도 서점에는 아랍과 인도, 페르시아, 터키의 이슬람 사상가들의 번역서가 대저를 이룬다.
그러나 그 변방의 위치가 이제는 유리한 지점이 되고 있다. 터키와 이집트, 이란처럼 중동의 패권국으로 등장할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로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슬람 세계의 혁신과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의 종착지에서 이슬람의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사상적 되감기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의 再活(재활)에 정성을 쏟고 있다. 15억 무슬림을 대표하는, 유엔 다음으로 큰 국제기구이다. 이 조직을 통하여 이슬람 공동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이슬람형 민주주의를 모색한다. 이슬람 교리를 정치적 언어로 변경하여 지구적 공론장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이다.
서구적 가치를 배타시하지 않고 이슬람형 민주와 인권 추구를 통하여 평화롭고 건설적인 '지하드(Jihad)'를 꾀한다는 점에서 퍽이나 미덥다. 실로 이슬람은 유라시아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 세계 종교가 아닐 수 없다. 인구 추세를 보건데 21세기의 최대 종교가 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 이슬람 국가들의 견문을 이어가면서 '이슬람적 근대'의 모험 또한 계속 주시하려고 한다.
지난 20세기, 수카르노는 혁명으로 서방을 뒤집으려고 했다. 수하르토는 발전 국가로서 서구를 따라잡으려고 했다. 21세기 인도네시아는 '만달라 국가'의 갱신으로써 '네트워크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 이웃 애를 나누고 지구 공동체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동적 균형자'를 도모한다.
정치적 혁명과 경제적 발전을 지나서 문명적 中興(중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양 세계를 복원하고 이슬람 세계도 재건하고자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개막 연설에서 "미래는 적도에 있다"고 선언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적도의 대국이자, 열대의 열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핫 트렌드(Hot Trend), 훈풍(薰風)의 진원지가 되길 기원한다.
반면 아시아의 또 다른 열도 국가는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화해와 통합을 교란하는 삭풍(朔風)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반동의 선봉에 선 북방의 섬나라, 일본을 긴히 짚지 않을 수 없겠다.
[유라시아 견문] 미일 동맹 : 반동의 축
일본이 진짜 '지구 방위대'! 첫 번째 타깃은 한반도?
일본 : 속국의 비애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를 마치고 각국의 정상들은 반둥으로 이동했다. 반둥에서 따로 열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몇몇 인사들이 있었다.
일본의 아베 신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상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 정작 마음은 콩밭에 있던 것이다.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반둥 시민들은 각국의 깃발을 흔들며 정상들의 행진에 일일이 박수로 환대했다. 일장기를 들고 있던 어린 학생들만은 끝내 시무룩할 수밖에 없었다.
반둥을 외면한 아베가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한 날은 4월 28일이었다. 의미심장한 날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된 날이기 때문이다. 전범 국가 일본이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그러나 이상한 복권이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북조선은 자리에 없었다. 일본에 맞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던 소련과 신중국도 없었다. 오로지 미국만이 일본의 독립을 허용해준 것이다.
즉, 4월 28일은 훗날 '샌프란시스코 체제' 혹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라고도 불리는 동아시아 분열의 화근이 된 날이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굴욕의 날(屈辱の日)'이라고 부른다. 본토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는 미군 통치 하에 남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즉 왕년의 류큐는 일본 안의 아시아였다. 2015년 4월 28일, 오키나와는 다시 굴욕을 맛보았다. 아시아 또한 재차 모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반둥 정신을 버리고, 반동 노선을 택했다. 전후 70년, 평화 국가는 죽었다.
2005년, 일본 유학을 떠났다. 전후 60주년이었다. '8.15'를 도쿄에서 보냈다. 우익들이 총집결한 야스쿠니 신사도 가보았다. 일본을 첫 유학지로 삼은 것은 일본의 선택이야말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향배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웃애를 발휘하여 일본의 回心(회심)을 성심껏 돕고 싶었다. 그래야 동아시아가 화평하고 남북 통일의 기운도 무르익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로부터 꼬박 10년, 배신감이 자욱하다. 그러나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선다. 미일 동맹 강화는 일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독배이다. 비난하고 성토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미운 정이고, 몹쓸 정이다. 그놈의 의리이다.
아베는 꼭두각시다. 기시 노부스케로 거슬러 오르는 그의 혈통까지 거론되지만, 내 보건데 아베는 철없는 '도련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외조부에 견주어 한참이 모자란다. 그의 책을 두 권 읽어 보았지만, '사상'이랄 것이 없다. 철없는 철부지에 가깝다. 그런 아베를 배후에서 부리고 있는 세력은 외무성과 재무성 등 관료 집단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했던 민주당 정권이 조기에 좌초하고 자민당 독주가 복원된 것에도 관료 집단의 몽니가 크게 작용했다. 즉 일본의 핵심 권력은 자민당 막후의 고위 관료들이다.
이들의 국가 전략은 단순하다. 일본을 미국과 일체화시키는 것이다. 착착 진행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마련했다. 무기 수출 3원칙도 철폐했다. 마침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지구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제 자위대가 지구 방위대가 된다.
그런데 아직 의회 비준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방적으로,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비밀보호법이 필요했다. 일본을 미국의 속국으로 삼는 방책을 정부 단독으로 극비리에 추진한 것이다.
미국의 패권 상실을 되돌리기는 힘들다. 대신에 그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그래서 일본은 사력을 다한다. 일본의 정책이 미국의 패권 사수에 맞추어져 있다.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달러의 연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중앙 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한다. 서태평양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기지 건설을 마다하지 않는다.
응당 대미 종속 강화는 일본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다. 양적 완화 정책은 일본의 통화와 금융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오키나와의 눈물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재정은 악화될 것이며, 복지 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잠재적 테러 위협은 늘어날 것이다. 대미 종속이야말로 일본의 약체화, 재정의 파탄, 빈곤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썩은 동아줄을 부여잡고 거듭 제 발등을 찍고 있다. 속국의 맹목이고, 비애이다.

ⓒAP=연합뉴스
미국 : 기생적 패권
속국을 저 지경으로 몰고 있는 것은 그만큼 패권국의 신세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모순을 노정하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아베가 양원 합동 연설을 한 미국 하원은 1941년 진주만 공습 다음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일 개전 연설을 한 곳이다. 그래서 망언을 일삼는 일본 수상들의 연설을 단 한 차례도 허가해주지 않았다.
부시가 그토록 어여뻐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끝내 연설이 무산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아베는 허용이 된 것이다. 아니 환영하고 환대해 주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론, 백악관까지도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만큼 미국은 조급하고 다급하다. 그래서 결국 패착을 범했다. 비굴한 선택이었다. 일본의 돈과 힘에 기대서라도 패권을 이어가야한다는 조바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일본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 외교에 공짜는 없다. 극진하고 융숭한 대접이야말로 일본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 그러하다. 임기 말년의 오바마는 마지막 업적으로 TPP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부터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본인이 속한 정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베를 내세운 측면이 크다. TPP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의 뜻에 충실히 따라만 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베를 미 의회에서 연설시킨 것은 TPP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고도의 연출에 가깝다. 아베는 미국서도 꼭두각시였다.
TPP는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계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반영한다. 대자본이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기획의 최종판이다. 미국의 대자본이 일본 등 여타 가맹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전체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자본은 이미 글로벌 자본이다. 여차하면 여타 국가의 동종 기업들과 연합하여 자국을 제소하여 미국의 정책마저 변경하려 들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권 기관인 미국 의회조차 교섭의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한다. 백악관이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대자본이 직접 백악관을 움직이고 있다. 이 미국 판 '정경유착'에 국민의 복지와 사회의 정의는 안중에 없다. 오로지 '악마의 맷돌'만이 기승을 부린다.
이처럼 미국은 속국에 덕을 베풀고 배려를 하기는커녕, 속국을 착취하지 않으면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기생적 존재가 되었다. 모자란 국방비를 동맹국들이 대신 충당해주어야 하고, 미국 국채를 계속 구매해서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유지해주어야만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늙은 패권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병마개로 막아두고 관리했던 일본의 재무장마저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생적 패권에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권위가 수반되지 않는 권력의 추락은 시간의 문제이다. 조짐은 이미 자카르타에서부터 보였다.
블록(Bloc)과 네트워크(Network)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던 자카르타에서는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도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여기서는 캄보디아 총리 훈센의 개막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이 TPP를 통하여 아세안을 반 토막으로 쪼개려 든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둥 회의 60주년인 2015년은 아세안에도 획기적인 해이다. 올 12월이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가 출범한다. 냉전기의 진영 논리와 분리 통치를 넘어선 평화와 번영의 동남아 시대가 목전에 달한 것이다. 출범 과정도 모범적이었다. 특정 국가의 독주 없이 대/소국 간의 '합의제 민주'를 구현하며 바림직한 지역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환태평양'으로 줄을 서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분열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일 양국이 비밀리에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식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서구가 규칙을 만들고 비서구는 체스 판의 졸로 삼았던 20세기형 지정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누습이고 적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형세에 어설픈 중립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입 발린 소리는 지적 허위이고, 사기이다. 가슴이 아프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당분간 접어두는 편이 낫다. 당장 일본에 대안 세력이 부재하다. 있다 해도 한 줌이다. 야당은 허약하고, 재야와 학계에는 정치적 실천력을 수반하지 못한 입진보가 허다하다. 한국의 사상계도 일본의 담론을 수입 가공하던 백년의 구습을 떨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自强(자강)해야 한다.
작금의 길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전혀 아니다. 覇道(패도)를 부리는 세력과 王道(왕도)를 소망하는 세력 간의 일합이 있을 뿐이다. 반동파와 반전파의 길항이다. 구체제와 '신상태(New Normal)'의 대결이다. 20세기와 21세기의 충돌이다. 미일 동맹은 반동의 축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분단 체제의 심화를 솔선하는 '惡友(악우)'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 군사력의 60%를 아시아에 투입하여 패권을 고수하려는 추한 노욕이다. 이로써 중국에 숨죽이고 있던 군사 강경파들을 격발하여 '화평굴기'를 좌초시키고 '조화 세계'를 파괴하는 신냉전을 획책한다. 애당초 20세기의 '냉전'부터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려던 미국발 패권책이 아니었던가.
무릇 제 버릇 남 주지 못하는 법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뉴욕 발 세계 공황의 위기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극복했다. 베트남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거짓 선동으로 일으켰다. 북조선을 핑계로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 일본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마침내 한반도 재진출이라는 숙원을 풀 기회가 열린다. 그들의 20세기를 보노라면 전혀 허황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1905년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필리핀과 한반도의 지배교환을 승인했던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다. 조선의 식민지 전락과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100년 비극의 뿌리에 미일 동맹이 있었다. 20세기 동아시아 天下大亂(천하대란)의 원흉이 미일 동맹이었던 것이다. 미군은 이미 철수했던 필리핀에 다시 진입했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를 호시탐탐할 차례이다. 하여 뜬구름 잡는 균형 감각일랑 거두어들일 일이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쪼개고 나누는데 여념이 없다. 일본은 그 반동적 책략을 거드는 아시아의 주구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의 중국이 100년 전 대청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든 대국이 아니라, 건국 60년을 갓 지난 싱싱한 새 나라이다. 냉전형 사고는 진즉에 버렸다. 반동의 지정학(Bloc)에 반전의 지경학(Network)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쪽은 담을 쌓고 진을 치는 반면에, 다른 쪽은 길을 닦고 망을 엮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쪽은 70년 전(제2차 세계 대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유라시아 연결망의 한 축으로 파키스탄이 있다. 시진핑은 자카르타/반둥으로 오기 전, 파키스탄을 들렸다. 굵직한 합의들이 여럿 이루어졌다.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다. 다시 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린다. 모름지기 바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서두르면 자빠진다. 안달하면 오판한다.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라시아 견문] 파키스탄 : 일대와 일로 사이
미국은 총을 줬지? 중국은 돈을 준다!
철의 형제
4월 20일, 에어 차이나 보잉기가 이슬라바마드 창공에 진입했다. 국빈 자격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시진핑의 전용기였다. 파키스탄은 하늘에서부터 영접에 나섰다. 중국-파키스탄이 합작한 JF-17 전투기 다섯 대가 호위무사가 되어 비단길을 깔아주었다. 각별하고, 깍듯했다.
시진핑은 파키스탄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형제의 집을 방문하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는 양국의 우정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꿀보다 달콤하고, 철보다 강하다"며 장단을 맞추었다. 그로서는 학수고대하던 방문이었다. 21세기 파키스탄의 재건을 위해서도, 2018년 그의 재선을 위해서도 중국의 선물 보따리가 간절했다.
시진핑은 파키스탄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연설하는 외국 정상의 영예를 얻었다. 답례로 '1+4' 협력의 청사진을 밝혔다. 1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일컫는다. 경제회랑은 一帶(일대)와 一路(일로)를 잇는 중추이다. 파키스탄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렇게 빗대었다.
"일대일로가 萬國(만국)이 참여하는 교향곡이라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그 교향곡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4는 네 가지 사업을 지칭한다. 과다르(Gwadar) 항, 에너지, 인프라, 산업 공단 순이다. 이 4대 사업에 중국이 투자하는 비용은 4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다. 일국에 대한 투자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제회랑이란 신장에서부터 아라비아 해에 자리한 과다르 항까지를 도로와 철도, 송유관, 광섬유 케이블 등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총 거리 3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사업이다. 그럼에도 15년, 즉 2030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회랑은 양국의 연결망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서부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과다르-카슈가르(Kashgar) 철도는 중앙아시아의 철도망 증설로 이어질 것이다. 카슈가르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을 지나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Andijan)까지 연결된다. 그곳에서 다시 카스피 해와 코카서스 지역까지 이어진다.
도로도 못지않다. 히말라야를 통과하는 1300킬로미터 카라코람(Karakoram) 고속도로는 수리, 확장할 계획이다. 카라치(Karachi)와 라호르(Lahore) 간에는 6차선 1240킬로미터 고속도로가 새로 깔린다. 덩달아 라호르, 카라치, 라왈핀디(Rawalpindi) 등 파키스탄 지방 도시들의 교통망도 향상될 것이다.
에너지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지금도 하루에 절반 가까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여기서도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일단 2018년까지 150억 달러 규모로 1차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2018년 이후에는 180억 달러 규모로 2차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 두 번을 합치면 파키스탄의 전력 공급량이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한다.
화력 발전소 지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청정 에너지 사업도 동시에 펼치기로 했다.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소도 만든다. 제룸(Jhelum) 강의 수력 발전소는 2020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간 파키스탄의 사회 불안은 상당 부분 전력 부족에 기인했다. 앞으로는 중국산 전력으로 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샤리프 총리의 재집권 전략이다.
2008년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파키스탄 지원금은 70억 달러였다.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그것도 대부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 안보 지원이다. 게다가 그 내실을 따지면 무기 재고 처분이 상당하다.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형 상부상조(Win-Win)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실제로 파키스탄 국민들의 중국 호감도는 80%까지 치솟았다. 반해 미국은 15%에 그친다. 미국과 서방은 글로벌 테러리즘의 온상이 된 파키스탄을 '실패 국가'로 낙인찍기 일쑤였다.
물론 중국의 시혜가 일방적 일리 없다. '철의 형제'는 역사적 산물이다. 파키스탄은 비공산권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들 중의 하나였다.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해는 1951년이다. 보답으로 중국은 핵무기 등 민감한 기술을 전파해 주었다. 한때는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 원조의 3분의 1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기도 했다. 냉전기 제3세계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을 선전하는 전시장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21세기 실크로드의 첫 삽을 뜨는 모델하우스가 되었다. 중국개발은행과 중국공상은행 등은 금융을 지원하고,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인프라 사업을 펼치는 첫 번째 훈련장이 된 것이다. '철의 형제'는 '전천후 동반자'가 되었다.

▲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로 통하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와 북서아프리카로 통하는 아라비아해의 길목에 위치한 파키스탄 과다르 항.ⓒwikipedia.org
과다르 항 : 남아시아의 허브
경제회랑 건설의 백미는 과다르 항이다. 과다르 항에 이르기 위해서 3000킬로미터의 연결망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일단 과다르-신장의 송유관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스와 석유를 중국에 공급하는 바다의 지름길이 된다. 말라카 해협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비용은 절반으로,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철도와 도로 또한 중국과 중동을 잇는 내륙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양과 대륙, 일대와 일로를 잇는 거점에 과다르 항이 자리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잇는 축이기도 하다. 30억 인구의 시장 통합에 파키스탄이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과다르 항은 시진핑의 방문에 맞추어 개장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만개하는 것은 국제 공항이 완공되는 2017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회랑이 완성되는 2030년에 극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40년간 항만 운영권을 확보해 두었다. 16억 달러를 더 투자하여 국제 공항을 신설하고 항만과 연안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가스관도 과다르 항을 통과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과다르 항 일대를 남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 계획이다. 동북아의 홍콩이나 동남아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허브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동반 성장'한다.
실제로 신장은 황해보다 아라비아 해가 더 가깝다. 우르무치에서 보면 상하이는 카라치보다 두 배나 더 멀다. 그래서 신장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경제회랑이 완성되는 2030년대가 되면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신장을 통하여 (재차) 직통하게 될 것이다.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협력하면 할수록 과다르 항은 번창할 것이며, 파키스탄 또한 번영을 구가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교역량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역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환점이었다. 경제회랑 건설로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광저우, 상하이, 선전, 이우 등 동부의 연안 도시에도 파키스탄 상인들이 속속 등장했다.
20세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활약하던 파키스탄 디아스포라들이 구대륙으로 이주하여 '중국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카슈가르와 광저우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도 번갈아 참여하고 있다. 당장은 의류와 가정용품 등 소규모 일용품에 편중되어 있지만, 경제회랑이 발족하면 그 풍경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파키스탄 상인들도 중화 세계와 아랍 세계의 연결자가 된다. 본디 파키스탄 일대는 고대부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교차점이었다. 장건(張騫)이 파키스탄에 달한 것은 자그만 치 2000년도 전이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안보적 함의도 크다. 파키스탄의 정치적 안정은 신장으로까지 파급을 미친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분리주의자들이 활동비를 구하고 군사 훈련을 받는 곳이 파키스탄 북서부 와지리스탄(Waziristan) 주와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이다. 즉, 신장을 독립시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의 거점이 파키스탄이었다.
이들은 소련 해체 이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독립 국가를 염원한다. 2013년 톈안먼 광장 테러의 배후이자, 2014년 쿤밍 기차역에서 일어난 칼부림의 주역이었다. 그들의 방침은 중화 세계와 아랍 세계의 연결망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교통망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운남성의 성도 쿤밍 또한 동남아로 향하는 연결망의 축이었다.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는 담을 쌓고 벽을 세우는 쪽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다. 중국은 길을 닦고 망을 엮어 중화-아랍 네트워크를 복원하려고 한다. 유럽형 세계 체제(Inter-State System) 이전의 유라시아형 세계 체제(Trans-State System)를 재건하고 갱신하는 최전선에 우루무치-과다르 항 경제회랑이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몽
시진핑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을 들린 이후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곧 국제 사회로 복귀하여 '보통 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란에는 이란-파키스탄 가스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테헤란-이슬라바마드-자카르타-우루무치를 크고 넓게 연결하여 이슬람세계와 중화세계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쌓아둔 국부를 십분 활용하여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공재를 이슬람 세계에 제공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이슬람의 문명 충돌과는 일선을 긋는 문명 간 연합의 탐색이다.
이슬람 세계만으로 그치지도 않는다. 시진핑이 이슬라바마드를 방문하기 이틀 전,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파키스탄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최초로 합동 군사 훈련에 합의했다. 또 러시아는 이란에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했다. 즉 '보통 국가화'하고 있는 이란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이다.
고쳐 말해 이란의 정상 국가화란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거두고 '역사의 종언'(서구화, 민주화)의 막차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서로는 터키, 북으로는 러시아, 동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파키스탄 및 인도 등과 협동하여 '유라시아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는 상하이협력기구이며,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확대일로이다.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정상 회의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란, 터키까지 두루 아우를 기세이다.
유라시아의 (재)통합은 비단 중국몽에 한정되지 않는다. 로마 제국 때부터 내려온 유러피언 드림이기도 하다. 중국발 일대일로에 미국과 유럽의 반응과 대응이 사뭇 다른 기저라고도 하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과 한무제의 서역 원정을 계승하여 유라시아의 大一統(대일통)을 처음으로 완수한 이가 '13세기의 사나이', 칭기스칸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마침 몽골의 울란바토르이다. 칭키스칸 광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마르코 폴로 라운지'에 앉아 있다. 게다가 거리 이름은 '서울의 거리'이다.
'서울의 거리'에 있자니 서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북방인은 세계를 아래로 내려다본다. 동아시아가 왼편에 있고, 유럽이 오른쪽에 있다. 유라시아가 한 눈에 조감되고, 한 손에 잡힐 듯하다. 절로 신라와 페르시아가 이웃사촌처럼 보인다. 나라별로 토막 났던 국사들이 하나의 지구사로 합류한다.
그러자 한반도의 남/북과 우크라이나의 동/서도 겹쳐 보인다. 하나의 세계 속에 한반도의 위치가 또렷하게 포착되는 것이다. 하여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허황한 구도에도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오식과 오인이 오판을 낳는다. 동북아의 局地(국지)에 함몰되어 유라시아의 大局(대국)을 놓쳐서는 곤란하겠다.
신냉전은 천부당만부당이다. 신냉전과 탈냉전의 갈등이다. 유라시아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세력과 유라시아의 분할과 분열을 꾀하는 세력 간의 길항이 있을 뿐이다. 유연한 視座(시좌)의 확보가 사활적이다.
5월 9일, 전승 기념일 70주년을 울란바토르에서 지켜보았다. 목하 유라시아의 時勢(시세)를 상징하는 각별한 행사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주년의 의미를 '北方(북방)'에서 조망해본다.
[유라시아 견문] 붉은 광장 : 기억의 전쟁
전쟁 끝낸 진짜 영웅은 맥아더 아닌 주코프!
역사 동맹
지난 5월 9일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 대전 전승 기념일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만5000명의 군인에 190대의 탱크, 150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 다른 나라 군인도 700명이 참여했다. 으뜸은 102명을 파견한 중국이었다. 인민해방군이 붉은 광장에 등장했다.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탈린-마오쩌둥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배경 음악이 각별했다. 가곡 '카츄샤(Катюша)'가 흘러나왔다. 전장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러시아 여인의 마음을 그린 곡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널리 불렸던 노래로, 러시아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비단 러시아만도 아니었다. 1950년대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할 무렵 중국, 몽골, 북조선, 북베트남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울란바토르의 어르신들도 절로 따라 불렀다.
그럼에도 붉은 광장의 군사 행진은 무력 과시에 그치지 않았다. 브릭스(BRICs) 국가와 유라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된 외교 행사였다. 서방(미국, 서유럽, 일본)은 자리에 없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여했던 10년 전과 가장 큰 차이였다. 더불어 '역사 전쟁'을 선포하는 상징적 무대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해석권을 되찾아오는 과업에 푸틴과 시진핑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과 합작하여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반성한 일본과 손을 잡고 신냉전을 획책하려 든다. 태평양 전쟁 이전, 즉 1941년 이전에 대해서는 안면몰수, 시치미를 떼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호흡을 맞춘다. 우크라이나 극우파들은 홀로코스트의 상징인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가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기가 막힌 러시아 당국이 기밀 문서까지 공개하여 반박했을 정도이다. 7600명의 유태인을 아우슈비츠에서 구출한 것은 명명백백 소련군이었다. 유라시아의 동과 서에서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에 맞서 중러 양국이 '역사 동맹'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부터 기억의 왜곡과 조작이 허다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원폭 투하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 소련의 공헌과 중국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역시나 냉전이 병통이었다. 동서 냉전으로 역사 해석이 갈라진 것이다. 서방 및 미국의 아시아 속국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체주의에 맞서 활약했던 소련의 공헌을 잘 모른다. 오히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동일시하는 '자유주의 사관'이 만연해 있다. 과연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는 법이다. 미국은 역사 교과서와 대중문화 산업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해왔다. '홀로코스트 산업'을 비롯한 '문화 냉전'을 기획했다.
물론 미국에도 '양심적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유럽 전선의 핵심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43년)를 꼽았다. 한 도시의 초토화를 대가로 소련군이 독일 나치의 5개 사단을 섬멸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는 쌍방 정예 150만 대군이 결전을 벌였다. 여기서 독일 최강의 탱크 부대가 참패했다.
두 전투를 계기로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즉 소련으로 말미암아, 고쳐 말해 스탈린이 히틀러를 이김으로써 '제3제국'이 좌초하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 노르망디 상륙은 마침표였을 뿐이다. 아시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을 앞서 지원한 것은 소련이었다.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에야 뒤늦게 참전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역이 소련과 중국이었음은 그 인적 피해의 숫자에서도 확연하다. 소련은 2700만 명이 희생되었다. 중국은 2000만 명이다. 미국은 40만 명에 그친다. 프랑스는 60만, 영국은 45만 명이다. 심지어 전범 국가인 독일은 700만, 일본은 300만 명이다. 즉 2차 세계 대전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주도한 전쟁이 아니었다. 소련과 중국이 유라시아의 동과 서에서 나치즘과 파시즘을 격퇴시킨 '유라시아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다. 러시아는 '조국 수호 애국 전쟁', 중국은 '항일 구국 전쟁'을 선호한다.

▲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70년 전 참전 용사 복장을 한 군인들이 광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39년 할힌골 : 분수령
1937년(중일 전쟁)과 1941년(독소 전쟁, 태평양 전쟁) 사이에 1939년이 있었다. 몽골 최동단에 자리한 자그마한 할힌골이 세계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1932년 만주국 수립으로 일본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었다. 남북을 가르는 허라허 강을 사이로 소련군/몽골군과 일본군/관동군이 대치한 것이다.
일본은 러일 전쟁(1905년) 승리로 러시아를 낮추어 보았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탈바꿈한 러시아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이미 초기 공업화도 일단락 지었다. 강철로 단련된 현대 국가, 소련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 소련과 제국 일본의 완충지가 몽골인민공화국(1924년)과 만주국이었다. 각기 소련의 위성국과 일본의 괴뢰국이었다. 결국 양국의 국경선 충돌이 일소 전쟁으로 치달았다. 러시아/몽골에서는 할힌골 전투, 일본서는 노모한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전투도 사건도 충분치 않은 진술이다. 대규모 전쟁이었다. 장소는 몽골 초원이고,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그쳤지만, 매우 현대적인 의미의 국지전이자 제한전이었다. 일본과 소련 쌍방이 투입한 병력도 10만 명을 헤아렸다. 1000대의 전투기와 수백 대의 탱크도 동원되었다. 사상자는 1만8000명에 이른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획기적이었다. 아시아 최초의 탱크 대전이었다. 여기서 소련의 신성 주코프 장군이 등장했다. 그가 이끌던 소련의 탱크 부대가 투입되면서 판세가 뒤집어졌다. 욱일승천하던 '황군의 꽃' 관동군을 처음으로 꺽은 것이다. 제국 일본 패망의 시작이었다. 특히 최초로 구사한 육공 입체 작전이 주효했다.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전쟁이 할힌골 전투였다. 공중전과 지상전을 결합하는 전술은 훗날 현대전의 교본이 되었다.
그러자 나비 효과가 일었다. 관동군이 패배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향로 전체가 변경되었다. 몽골과 시베리아 등 북진(北進)이 봉쇄당하자 남진(南進)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노선 전환에는 관동군 사령관 출신 도조 히데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주코프의 적군(赤軍)을 대적하기가 어렵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로 진출했다. 군부의 중심도 육군에서 해군으로 이동했다. 국책 담론도 전환되었다. 소련과 합작하여 일본을 개조하고, 영미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를 극복하자는 동아협동체론은 기각되었다.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전면화되었다.
동아협동체론을 입안한 브레인은 오자키 호츠미였다. 그는 소련의 스파이 조르게와 내통했다. 즉시 일본의 노선 전환을 전해주었다. 조르게도 즉각 모스크바에 타전했다. 덕분에 스탈린은 극동군을 유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대독 전선에 소련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주코프가 대활약했다. 1941년 12월 개시된 대독일 반격에 진두지휘를 맡았다. 할힌골의 대승을 이끌었던 지상전/공중전의 배합이 또 한 번 쾌거를 일구었다.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쿠르스크에서 연전연승했다. 끝내 베를린도 함락시켰다. 명실상부 제2차 세계 대전, 최고의 명장이었다. 맥아더는 비할 바 못 되었다.

▲ 제2차 세계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웅 게오르기 주코프. ⓒrealmadridbalkan.org
주코프가 유럽 전선에 등장한 바로 다음날,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즉 1941년 12월 6일과 7일은 제2차 세계 대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틀이었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본다. 일본이 재차 북진을 감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련이 유라시아의 동서 양면에서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대적할 수 있었을까.
혹 소련이 무너졌다면? 독일의 제3제국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유라시아를 양분했을까?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했다. 그 개연성을 말소시킨 것이 1939년 할힌골 전투였다. 결정적 사건이었다.
유럽에서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은 5월 8일이다. 소련군이 다시 유라시아를 건너 대일 개전을 선언한 날은 8월 8일이었다. '폭풍 작전'으로 관동군의 무장을 해제해갔다. 북조선, 사할린, 쿠릴 열도까지 남진했다. 1945년 소련은 1905년 러일 전쟁을 역전시켰다. 만주를 재탈환하고, 한반도의 북쪽까지 접수했다. 그럼으로써 국공 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출발이기도 했다.
몽골의 역사 박물관에서는 한창 제2차 세계 대전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응당 할힌골 전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들로서는 영광스러운 기억이다. 관동군을 격파하는데 몽골군이 기여한바 컸기 때문이다. 최초의 육공 합동 작전에서 그들은 말과 활, 칼로 싸웠다.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후방에서 대포를 쏘아 올리면 몽골군이 말을 타고 진격하여 관동군의 목을 베고 심장을 뚫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국공 내전에서는 중국공산당을 도왔다. 한국 전쟁에서는 북조선을 지원했다. 4만 마리의 군마(軍馬)를 평양에 보냈다. 북조선 전쟁 고아 수만 명을 탁아소에서 길러주기도 했다. 당시 몽골인민공화국(1924~1992년)은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공산 국가였다. '선진국'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
'붉은 몽골'이 가장 빛났던 시절이기도 했을 것이다. 전승기념일 전야, 몽골인들은 '칭기스칸 보드카'로 축배를 올렸다. 울란바토르의 하얀 밤(白夜)이 더욱 하얗게 불타올랐다.

ⓒ팟캐스트 역사책읽는집

ⓒ팟캐스트 역사책읽는집
유라시아 전쟁?
미국의 저명한 일본 연구자들이 아베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실천적 지식인들의 양심적 목소리에 나도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못내 불만이 컸다. 모자라고 미흡했다. 비판의 주종(主從)부터 잘못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이 아니다. 그것을 눙치고 감싸 도는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즉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는 주구이고 첨병일 뿐이다. 따라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본국부터 호되게 호통 치셔야 했다. 아베 못지않게 노벨평화상까지 선납 받은 오바마 또한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왜 義(의)를 버리고 利(리)를 따르십니까?', '속국을 德(덕)으로 교화하십시오.' 통촉해야 했다. 그래야 대국의 영(令)이 서는 법이다.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가는 미국부터 바로잡으셔야 했다.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점도 내키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실체를 가리는 명명이다. 애당초 제2차 세계 대전이란 무엇이었나? 미국발 세계 공황의 후폭풍이었다. 전체주의도 대공황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가 근원적 화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은 이러한 역사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책임을 독일과 일본에만 떠넘기고, 자기 책임을 지워내 버린다.
그 후 미국이 태평양 건너 유라시아에 개입했던 일련의 전쟁, 국공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아우르노라면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거듭된 분할/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 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대국'으로서 자격이 미달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 경험과 실감에 맞는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 自强(자강)하는 첩경이다.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은 명백히 유럽의 관점이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식 독법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름 바로 짓기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이름으로 고쳐 부르고, 똑바로 불러야 한다.
일본이 반동 노선의 전위가 된 것도 '그 전쟁'의 일부였던 '유라시아 전쟁'을 망각했음이 커다랗다. 태평양 전쟁에 함몰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후안무치와 (미국에 대한) 피해망상을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대동아 전쟁'이었을 뿐이다. '대동아'는 화들짝 감출 말이 아니다. 반추하고 성찰해야 할 뜨거운 화두이다. 혹자의 수사처럼 '불 속의 밤'이다. 그 밤을 움켜쥐어야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대동아 전쟁, 한국 전쟁, 중소 분쟁,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진 20세기의 천하대란을 일이관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동아시아의 100년도 유라시아 천년사의 지평에서 조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20세기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길을 답습했다. 그는 일찍이 조선을 지나 명(明)을 치겠다고 했다. 나아가 인도까지 가겠다고 했다. 허장성세였으되, 허언만은 아니었다. 역사를 꿰뚫고 있었다.
만주를 장악하면 북방으로 중원으로 진출이 용이하다. 그 기세로 동남아와 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 즉 왜족도 만주족도 '몽골의 길'을 따랐던 것이다. 만주족과의 경합에서 실패한 왜족이 와신상담한 것이 20세기였다. 대청 제국을 대신하여 대일본 제국이 굴기했다. 이번에는 한족이 왜족을 상대했다.
중일 전쟁으로 상징되는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였다. 20세기 후반기에는 소련과 중국이 적대했다. 유라시아의 판도를 두고 북방 제국과 중원 제국이 길항했다. 좌/우 대결은 잠시였고 '사회주의 국제주의'도 한 철이었다. 유라시아 천년을 규정했던 북방(유목 문명), 중원(농경 문명), 남방(해양 문명)의 삼분 구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유라시아 전쟁'이라는 개명(改名)에 대해서는 운만 띄우기로 한다. 9월 3일이면 중국도 전승기념일이다. 붉은 광장에 이어 천안문 광장에서도 항일 전쟁 승리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 전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기세다. 과연 '유라시아 전쟁'이 정명(正名)인 것인지 재차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다. 1주일간 견문했던 (외)몽골 얘기부터 먼저 풀어내기로 한다. 대초원에서 펼쳐진 몽골(사)이야말로 유라시아(사)의 축도(縮圖)였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견문] 몽골 : 유라시아의 축도
칭기스칸의 경고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신정(新政) : 백년의 급진
모든 비극의 출발에 '새 정치'가 있었다. 대청제국이 '신정(新政)'을 단행함으로써, 몽골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중국이 동방형 제국이기를 멈추고, 서구형 국민 국가가 되고자 한 것이다. 몽골로서는 배반이었다. 대청제국은 만몽연합에서 출발했다. 만주족은 몽골족과 협동함으로써 한족을 누르고 중원을 차지할 수 있었다. 몽골은 그 대가로 자치와 자주를 누렸다.
만주족은 잠재적 위협인 몽골족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리 통치'를 행한 것이지만, 몽골은 덕분에 '중국화'와 '한족화'를 면할 수 있었다. 라마불교를 신봉하고 몽골어를 사용하면서 근 300년을 지낸 것이다. 즉, 대청제국은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세계를 품고 있었다. 동남부는 농경 문명과 유교 세계였으며, 서북부는 유목 문명과 불교/이슬람 세계였다. 대청제국의 황제들은 한족들에게는 천자였으되, 몽골인들에게는 대칸이고 법왕이었다.
20세기의 '새 정치'란 바로 그 복합 국가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신정과 함께 '근대화=중국화'가 본격화되었다. 유교 교육이 강요되었고, 한문 쓰기를 강제했다. 한족과의 통혼이 장려되었고, 유목을 접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몽골은 '변법(變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반(反)중국 운동에 승려와 사원이 앞장섰다. 대청제국에서 철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하에서 이탈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911년 독립을 선언했다. 신해 혁명을 촉발한 무창 봉기보다도 앞서 일어났다. 20세기 아시아 최초의 독립 혁명이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독립을 추구했으되, 자강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존과 자부는 있었으되, 자력갱생에는 못 미쳤다. 천하(天下)에서 벗어나자 중국은 외국(外國)이 되었다. 압도적인 이웃나라와 '평등'해져야했다. 그래서 남의 힘을 빌어야 하는 역설이 일어났다. '세력 균형'의 국제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에 의존했다. 라마교로 연대하는 불교 연방 국가를 모색했다. 물질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에 기울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신정(神政) 국가를 건설할 것을 도모했다. 1915년 맺어진 중국-몽골-러시아 간의 캬흐타 조약은 이행기의 흔적이었다. 몽골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독립을 인정받았으되, 중국 또한 '종주권'을 유지한다고 결착이 났다.
'자주적인 속국', 중화 세계의 조공국과 유사한 위치에 그쳤던 것이다. 몽골로서는 충분치가 않았다. 그래서 더욱 러시아에 안달했다. 그럼으로써 러시아 혁명의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적색 물결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 몽골이었다. 초원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1920년 몽골의 불교 지도자 보그드 칸이 중화민국 총통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청제국에 이어 중화민국에서 벗어나는 제2차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근대적인 정당도 등장했다. 몽골인민당이 창설되었다. 민족 혁명가 수흐바타르도 등장했다. 그는 보그드 칸의 인장을 들고 러시아를 찾았다. 그를 접견한 이는 러시아 제국의 차르가 아니라 소련의 혁명가 레닌이었다. 레닌은 종교 국가를 부정했다. 볼셰비즘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중화민국에서 떨어져나가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흐바타르가 소련의 적군과 귀환한 것은 1921년이었다. '몽골공화국'이 출범했다. 1924년에는 '몽골인민공화국'으로 개명했다. 세계 두 번째, 아시아 첫 번째 공산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위성 국가였다. 사실상 소련의 속국이었다. '근대화된 속국'이었다. '속국의 근대화'였다. 1945년 이후 동유럽에 도열했던 위성 국가(satellite state)들의 원조였다.
1924년 이래 소련판 '신정'이 단행되었다. 수도 이름도 바뀌었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의 울란바토르(Улаанбаатар)가 되었다. 소련이 보기에 몽골은 낙후한 봉건 국가였다. 자본주의를 건너뛰고 공산주의로 곧장 도약할 것을 강권했다. 대약진이었다. 농업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말을 타던 유목민들이 집단 농장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어갔다. 생래적으로 '모던 보이', '모던 걸'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은 '봉건의 유산', '계급의 적'으로 지탄받았다. 소련의 근대화 정책에 반대하는 몽골인민당 간부들은 숙청을 면치 못했다.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도 예외가 아니었다. 소련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다가 의문사로 제거되었다.
수흐바타르를 대체한 인물이 초이발산이었다. 소련 여성을 부인으로 둔 '몽골의 스탈린'이었다. 1952년 사망까지 장기 집권하며 몽골판 대숙청을 자행했다. 특히 라마 불교에 대한 탄압이 극성을 이루었다. 9할 이상의 불교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처형했다.
만주국 건국의 파장도 영향을 끼쳤다. 만주국은 은근히 중화 제국을 흉내 냈다.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를 내세우며 동방의 이상 국가를 표방했다.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모셔갔다. 몽골인들로서는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판 '신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만주국에 솔깃했던 것이다. 일본은 노련하고 노회했다. 만주국의 매력 공세로 몽골을 꾀어냈다. 중화민국서도 소비에트연방에서도 벗어나 만주국과 연합하는 '몽골국'이 되라고 유혹했다. 초이발산은 초조해졌다. 불교 세력들을 친일파로 몰아갔다. 만주국의 스파이라며 뿌리째 뽑으려 했다.
라마 불교 지도자들의 패착도 있었다. 전통적 지배층으로 지나치게 귀족적이었다. 대부분의 재산을 사원이 소유하며 민중 위에 군림했다. 어디까지나 소승(小乘)에 그쳤던 것이다. 소승의 민주화/민중화/근대화로써 대승(大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생들을 구제하여 지상에 극락을 구현하는 보살로서의 책무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하더라도 전통의 전면적 말살은 비극이었다. 불교 탄압은 곧 몽골 전통 문화를 담지한 지식 계층 전체에 대한 억압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유학한 과학적 유물론자들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활개쳤다. '신청년'들의 객기와 광기가 '조드'가 되어 한바탕 초원을 휩쓸고 갔다.
결국 몽골은 새나라가 되었다. 새마을도 생겼다. 사원과 게르 대신에 공장과 집단 농장이 들어섰다. 말과 양, 가축도 국가 소유가 되었다. 5개년 생산 계획에 따라 젖을 짜고 가죽을 벗겼다. 몽골 문자와 티베트 문자도 사라져갔다. 러시아어의 키릴 문자가 책을 채우고 거리를 점령했다. 신생아의 이름마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유행했다. 1963년 인구의 절반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되었다. 1985년에는 65%까지 달했다. 삽시간에 유목 국가가 노동자 국가가 된 것이다. '백년의 급진'이었다.

▲ 몽골의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와 레닌. ⓒ팟캐스트 역사책읽는집
민주화 : 몽골화와 세계화
그 체제가 오래갈 수는 없었다. 1986년 쇄신(шинэчлэл) 운동이 분출했다. 1990년 다당제가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헌법도 개정되었다. 몽골인민공화국은 사라졌다. 몽골국이 되었다. '민주화'로의 체제 이행을 경험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북조선/베트남/라오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붉은 몽골'은 확실히 동방보다는 동구에 가까웠다. 몽골인민공화국 시절 교역 통계를 보더라도 소련이 75%, 동유럽이 15%를 차지했다. 중국은 4%에 그쳤다. 물류와 문류 양면에서 몽골은 동구권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몽골판 '민주화'의 향로는 탈동구화이자 재동방화이기도 했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해가 바로 쇄신 운동이 일어난 1986년이었다. 소련군이 철수한 것도 다당제가 시작된 1990년이었다. 적성국가 한국과 수교한 것도 1990년이다. 소련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던 경제도 동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 재차 동아시아의 일원이 된 것이다.
흔히 1990년대 이후 몽골의 변화를 '민주화'라고 갈음한다. 충분치 못한 진술이다. 세계를 '민주 대 독재'로만 가르는 외눈박이 시선으로는 적절한 술어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갈수록 '민주화'라는 말조차 삐딱하게 보고 있다. 20세기 초기의 문명화, 중반의 근대화와 아울러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지배 이념은 아니었던가 의심을 품고 있다.
문명화는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논리였다. 근대화는 개발 독재의 명분이 되었다. 민주화 또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다. 문명화-근대화-민주화 간에는 묘한 연속성도 있다. 근대화가 탈식민화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민주화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무력화함으로써 발전 국가들이 축적해둔 국부를 강탈해가는 수단이 되었다. 하여 1980년대의 동아시아, 1990년대의 동유럽, 2000년대의 중앙아시아 및 중동을 아울러 '민주화'의 실질적 효과와 결과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여긴다. 유라시아의 곳곳을 견문하면서 민주화의 실상과 허상 또한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몽골은 또 하나의 전범이었다. '쇼크 독트린'이 동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먼저 관철된 곳이다. '민주화' 이후 몽골에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진출했다. 옛 공산국가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도입하는 전위 노릇을 한 것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몽골인민공화국 시절 축적해둔 몽골의 국부가 원체 변변치 않았다는 점이다. 종속 이론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민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할 만한 자산이랄 게 마땅히 없었다. 덕분에 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의 경로에서 경험했던 파국적 금융 위기, '세계화의 덫'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몽골에서의 '민주화'란 '서구화'보다는 '몽골화'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탈동구화와 더불어 몽골의 전통과 개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칭기스칸의 복권이 상징적이다. 시내 복판에 있는 수흐바타르 광장부터 칭기스칸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붉은 몽골' 시절 몽골인들은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국제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민족주의의 화신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하여 칭기스칸의 귀환은 전통 복원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라마 불교도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는 토착적 무속 신앙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철국가에 억눌렸던 민간사회의 저력이 재생하고 재활하고 있는 것이다.
유목민의 기질도 재차 발현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애당초 '고향'이라는 관념이 미미하다. 게르부터가 계절에 따른 이동식 주거 공간이다. 매년 10여 차례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수도(首都)라는 발상조차도 희미했다. 현재의 울란바토르에 자리했던 이흐흐레(Ih Huree) 또한 대청제국 시절에는 스무 번도 넘게 장소를 이동했던 상징적 기호였을 따름이다. 몽골 세계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마저도 폐허처럼 남아있다. '성을 쌓는 자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를 되뇌며 살았던 유목민다운 문화재였다.
역으로 말하면 몽골인들에게는 모든 곳이 내 집이고, 전 세계가 곧 고향이다. 과연 '민주화' 30년, 몽골 인구의 1할이 몽골 밖에서 살고 있다. 몽골의 안과 밖을 순회하며 노마디즘을 향유한다. 몽골인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이주해서 살고 있고, 그 울란바토르 시민의 절반은 외국 생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몽골화 및 전통화가 곧 세계화에 부합하는 것이다.
당장 나를 도와 몽골의 동서남북을 안내해 주었던 운전기사 에르덴도 부산에서 5년을 살다왔던 유목민의 후예였다. 난생 처음 본 해운대 바다를 추억으로 품고 있는 26세 청년이었다. 비단 한국뿐이 아니다. 당장 몽골 초원을 가로지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요, 터키도 한 걸음이다. 게다가 몽골인들은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편이라고 한다. 타고난 천성이고 물려받은 기질이렷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유독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의 간판이 많았다. AIR TRANS, AIR MARKET, AIR WAYS 등 다양했다. 왕년의 초원길을 대신하여 하늘길을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몽골의 밖으로 나간 젊은이들은 온라인 금융망을 통하여 몽골의 안과 접속한다. MONEY GRAM, WESTERN UNION 등 글로벌 송금 업체도 여럿이었다. 즉 몽골은 영토 국가에서 가교 국가(Transit Mongolia)로 이행하고 있었다. 유목 국가의 속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골 간이역 같은 칭기스칸 공항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한창 제2 국제공항을 시공하고 있었다.

▲ 칭기스칸 동상. ⓒ팟캐스트 역사책읽는집
유라시아의 축도
붉은 광장에서 '역사 동맹'을 맺은 시진핑과 푸틴의 공동 성명 가운데 주목에 값하는 내용이 하나 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라시아의 패권를 두고 다투었던 북방 제국과 중원 제국이 유라시아의 대통합에 거국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간 미국은 EAEU를 '재소련화'라고 폄하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가 결합됨으로써 판세가 전혀 달라졌다. 중국은 EAEU 너머 EU 까지 내다보고 있다. 일대와 일로를 통하여 유라시아연합과 유럽연합까지 연결해 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야심이고 복심이다.
흥미로운 것은 유라시아의 이 거시적 통합의 마지막 열쇠를 몽골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여태 EAEU 가입을 미루고 있다. EA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베트남보다도 신중한 행보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도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울타리에도, 중국의 안보 우산에도 쉽사리 편승하지 않겠다는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양 대국 사이에서 지난 100년간 단련된 맷집이라고 하겠다.
1915년과 2015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몽골의 종주권은 중국에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보호국이라는 캬흐타 조약의 시대는 지나갔다. 유라시아의 대일통을 위해서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300만 소국 몽골을 정중하게 모시고 깍듯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라시아 대통합의 화룡점정도 몽골이 찍게 될 것이다. 21세기 유라시아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축도이다.
과연 유라시아는 몽골세계제국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하나가 되었다. 동서남북에서 각개약진 하던 국가와 문명들이 하나의 제국 아래 수렴됨으로써 '세계사'가 탄생하였고, '세계 지도'가 편찬되었다. 즉 몽골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자산은 땅 밑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이 아니다. 역사의 지층에 새겨두었던 유라시아 제국의 유산이다.
유럽형 세계 체제(Inter-state system)가 작동했던 20세기에는 사방이 막혀 있는 '내륙 국가'로 신음했으되, 유라시아형 세계 체제(Trans-state system)를 복구해가는 21세기에는 동서남북을 맺고 잇는 '가교 국가'로 비상하는 것이다. 북방에서도 오래된 세계가 새롭게, 다시, 펼쳐진다.
몽골 견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 (외)몽골국 아래에는 내몽골 자치주가 있다. 몽골도 일종의 분단 국가이다. '두 개의 몽골'이 병존한다. 내/외몽골 견문에 나선 가장 큰 이유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동아시아로 확대투영하지도 않고, 작금의 G2 구도를 과거로 소급적용하지도 않으며,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실상을 궁리하는데 북방의 분단 국가를 참조항으로 삼을 만 한 것이다. 내몽골로 향하는 기차가 울란바토르를 떠난 시간은 9시 10분이었다. 해가 지지 않은 북방의 밤은 여전히 환했다.
[유라시아 견문] 내/외몽골 : 제국의 유산
몽골 분단의 비밀…"칭기스칸의 부활을 막자!"
두 몽골
고비 사막은 거대했다. 울란바토르에서 꼬박 24시간을 가야 내몽골의 수도 후허하어터(呼和浩特)에 달한다. 드문드문 쌍봉낙타가 보이고, 뜨문뜨문 게르도 있었지만, 마을이라 할 만한 곳은 딱히 드물었다.
한 나절이 지나서야 거대한 풍력 발전소를 만났고, 비닐봉지와 페트병이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흔적이다. 외몽골의 국경 도시 자민우드에 도착한 것이다.
사막 한 복판에서 국경이 갈렸다. 간단한 출국 수속을 마치자 곧 오성기가 보였고 한문이 눈에 들었다. 중국의 국경 도시 얼롄하오터(二连浩特)였다. 불과 1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이번에는 입국 수속이 진행되었다. 번거로울 일은 없었다. 모든 절차가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짐 검사도 눈 시늉이다.
의아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입국 심사를 마친 기차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러더니 한 격납고 안으로 들어간다. 광궤의 차이로 기차 바퀴를 교환해야 했던 것이다. 몽골은 여전히 소련이 깔아준 철도를 사용하고 있다.
덕분에 역 밖으로 나가볼 수 있었다. 국경 도시의 풍경을 잠시나마 맛보았다. 중국임에도 여전히 키릴 문자 간판이 여럿이었다. 내 지갑에는 몽골 돈이 약간 남아 있었다. 구멍가게에 들려 사용할 수 있냐고 중국어로 물었더니, 주인아저씨는 몽골어로 대답한다. 눈치 상 되는 것 같다. 캔 맥주 둘을 샀다. 북경의 옌징 맥주도 아니고, 산동의 칭다오 맥주도 아니다. 흑룡강의 하얼빈 맥주이다. 역시나 이곳은 북방이었다. 그래도 잔돈이 남았다. 혹시 중국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분은 이번에도 몽골어로 대답하고 환전을 해주셨다. 말은 달라도 뜻은 통했다.

▲ 외몽골 국경 도시 자민우드 역. ⓒ이병한
역으로 돌아왔더니 기차의 생김새가 달라졌다. 내가 타고 왔던 몽골 기차 뒤로 중국 기차 다섯 칸이 붙었다. 몽-중 국제선에 중국 국내선을 합친 것이다. 국제선은 여전히 몽골 안내원들이, 국내선에는 중국 안내원들이 자리했다. '일차양어(一車兩語)'의 풍경이었다. 레일을 바꿔 단 기차는 쌩쌩해졌다. 한결 속도가 붙었다. 과연 철도 대국, 중국이었다.
내몽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리 간판들이었다. 몽골의 옛 문자들이 고스란히 쓰이고 있다. 몽골 문자와 한자가 병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시내버스 안내는 몽골어가 먼저이고, 중국어가 그 다음이었다. 키릴 문자가 전면화 된 외몽골과는 딴 판인 것이다.
외몽골에서 키릴 문자 전용 정책이 도입된 것은 1941년이다. 몽골 민족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민주화'와 함께 몽골 문자 복원을 선언했지만, 20년이 되도록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근 두 세대 만에 전통 문자를 완전히 소실한 것이다.
내몽골서도 문화 대혁명 시절에는 몽골어 교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개혁 개방과 함께 초등학교부터 다시 보급되었다. 몽골어 전용의 컴퓨터 자판도 만들었다. 지금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몽골어와 한자가 함께 표기된다. 이중 언어 생활, '일지양어(一地兩語)'의 실천이다. 한마디로 제국의 유산이다. 소련/(외)몽골과 중국/내몽골의 운명을 가른 기저라고 하겠다.
제국의 유산
 중화인민공화국은 몽골의 독립(과 대만의 미수복)을 제외하면 대청제국의 영토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현재 중국 땅의 절반이 18세기 만주족이 정복한 것이다. 그만큼이나 내/외몽골의 운명에도 대청제국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몽골의 독립(과 대만의 미수복)을 제외하면 대청제국의 영토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현재 중국 땅의 절반이 18세기 만주족이 정복한 것이다. 그만큼이나 내/외몽골의 운명에도 대청제국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내몽골은 대청제국 초기에 병합되었다. 만주족은 고비 이남의 내몽골과 연합하여 중원을 장악한 뒤, 고비 이북으로 진격했다. 외몽골(당시 할하 몽골)까지 정복을 완수한 이가 강희제이다. 즉, 고비 사막을 경계로 내/외몽골은 약 반세기의 차이를 두고 대청제국에 따로 편입된 것이다. 20세기 내/외몽골이 분화하는 먼 기원이었다.
대청제국에서 변경 통치를 담당한 기관이 이번원(理藩院)이다. 한족 관료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배타적 통치 기구였다. 이곳에서 몽골족에 행한 정책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몽골족과 한족의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다. 역사적 기억의 산물이었다. 몽골은 한족(송나라)과 연합하여 여진족(금나라)을 멸했던 바 있다. 그 여진족의 후예가 바로 만주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몽골족과 한족의 결혼도 금지했고, 몽골에서의 한문 교육도 배제했다. 그래서 대청제국 내내 몽골족과 한족은 서먹하고 소원했다. 한 지붕, 딴 가족이었다.
▲ 몽-중 국제 열차. ⓒ이병한
내/외몽골 간 접촉도 방지했다. 대청제국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되, 몽골족 전체를 아우르는 정체성을 배양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몽골에서의 활불(活佛)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칭기스칸의 핏줄에서 활불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 오로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만 인정함으로써 몽골에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리더십이 출현하는 것을 봉쇄한 것이다. 몽골족의 티베트 방문까지 제한시켰을 정도이다. 대신에 몽골 왕실과 귀족, 라마승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회유책을 구사했다.
대청제국은 분할 통치의 선구자였다. 중원은 군현제, 변방은 봉건제를 구사하여 대일통(大一統)을 달성했다. 몽골은 왕족과 라마승들이, 서장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귀족들이, 신장은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토착 관료들이 제 각기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통치했다.
매우 급진적인 형태의 '다문화주의'였고, 매우 조숙한 형태의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였다. 하여 몽골족과 장족, 회족, 한족들은 각기 만주족과 주종(主從) 관계를 맺되, 상호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대청제국의 천하(天下)는 물리적 결합이었지 화학적 통합은 아니었던 것이다. '중화 민족'이라는 20세기의 용광로(Melting Pot) 모델과는 전혀 달랐다.

▲ 후허하어터 라마 불교 사원. ⓒ이병한
제국에서 제국'들'로
제국의 유산은 20세기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국에서 국민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통상적 진술도 실상에 딱히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의 제국이 붕괴하자 여러 제국이 각축했다.
먼저 1911년 독립을 선언한 몽골부터 제국을 지향했다. 티베트 불교 서열 3위의 인물을 '복드칸(Bogd Khan)'으로 등극시켜 티베트와 연합하는 라마 불교 제국을 모색했다. '복드'는 몽골어로 신성하다는 뜻이다. 칭기스칸의 핏줄을 이어받은 활불을 재차 정치적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외몽골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내몽골과의 통합도 도모했다. '근대화=중국화'를 추구하는 신해혁명에 내몽골 지배층 또한 반발이 거세었기 때문이다. 몽골족의 입장에서 신해혁명은 한족이 만주족을 전복한 종족 혁명에 다름 아니었다. 황제를 대체한 총통이라는 제도 또한 낯설기만 했다. 종교적 신성함이 없는 세속적 지도자에게는 좀체 권위를 느낄 수 없던 것이다. 전통과 언어와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상이한 중화민국을 사절했던 것이다.
공화파 혁명가들은 변방의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혐오했다. '멍청한 몽골인(愚蒙)'이 시세를 전혀 따르지 못하는 구세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을 포용한 것은 역설적으로 '반동파'로 간주되었던 위안스카이였다. 그는 라마 불교 세력을 중시했다. 몽골제국을 복원하자며 내몽골을 유혹하는 복드칸에 맞서, 위안스카이는 대청제국이 보장했던 내몽골의 귀족과 승려들의 권리를 계승하고, 더 높은 직위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1912년, 21살짜리 내몽골 라마를 깍듯하게 예우하며 광명대국사(光明大國師)라는 직위까지 부여했다. 대청제국 시절보다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것이다. 그의 부모와 형제, 스승도 작위를 수여했다. 공화국 안에 제국을 품고자 했던 것이다. 아니 위안스카이는 서둘러 공화정을 거두고, 제정으로 복벽할 것을 도모했다.
위안스카이의 실각으로 중화민국은 복원되었으되, '제국의 근대화'는 지속되었다. 라마들에 대한 대접은 더욱 후해졌다. 봉급을 더욱 높여주고 경호원까지 제공했다.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의 등장은 중화민국에 도리어 기회였다. 공산 국가의 불교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불교 지도자들이 베이징으로 대거 피신한 것이다. 그들은 종교를 거세하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기보다는 중화민국의 품에 안기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그들이 베이징에서 조우한 이가 판첸 라마이다. 판첸 라마는 영국의 지원으로 독립을 추진하는 달라이 라마에 불만을 품고 티베트를 떠났다. 판첸 라마의 견해는 단호했다. 중화민국이야말로 대청제국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이기에, 외몽골도 티베트도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몽골의 소련, 티베트의 영국 모두 라마 불교에는 무지한 외세였을 따름이다. 즉, 대청제국이 달라이 라마를 모셨듯, 중화민국은 판첸 라마를 모시기로 했다. 1931년 판첸 라마는 호국선화광휘대사(護國宣化廣輝大師)가 되었다. '왕족을 존중하고, 활불을 공경하라(尊重王公, 恭敬活佛)'는 선전 구호가 널리 확산되었다.
중화민국이 판첸 라마에 정성이었던 것은 대일본제국과의 경쟁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도 판첸 라마에 무척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의 구호에 맞추어 판첸 라마를 적극 활용코자 했다. 나가사키에서 열린 범아시아 대회에 초청하고, 선양에서 열린 반소련 대회에도 초빙했다.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몽골로 진출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불교를 더욱 드높였다. 한편으로는 서구와 동구에 저항하며 동아의 문명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본제국에 도전하는 몽골 민족주의를 견제하기 위하여, 초국가적인 성격을 담지한 라마불교를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대일본제국의 공세에 맞서 중화민국 또한 '범아시아주의'를 설파했다. 몽골, 티베트는 물론 인도, 버마(미얀마), 태국(타이)까지 불교를 통해 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불과 승려들을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으로 초청하여 성대한 불교행사를 치르고, 쑨원의 무덤도 함께 참배했다.
답례로 승려들은 난징, 상하이, 항주(항저우)를 순례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중국의 통일을 강조했다. 그들은 몽골과 티베트, 만주는 중국임을 선포하며, 소련과 영국, 일본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마 불교(북방)와 삼민주의(중원)의 결합을 모색한 것이다. 즉, 대일본제국의 만-몽 연합 국가 건설을 저지하려 들면 들수록 중화민국은 점점 복합 국가=제국에 방불해져갔다. (외)몽골제국도, 대일본제국도 중화민국도 하나같이 대청제국을 흉내 내고 모방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근대 국가를 지향했으되, 실질로는 제국의 정통성을 과시하며 경쟁했다.

▲ 내몽골 회족 거리. ⓒ이병한
제국의 근대화
과제는 하나였다. 누구 중화 세계의 태평천하를 복원할 것인가? 최종 승리는 중국공산당의 몫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겠다.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제국의 근대화'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무엇으로? '대장정'이다. 대장정은 제국을 복원하고 갱신하는 기나긴 행군이었다. 근거지부터 서북 지역의 연안이었다. 변방에서 출발했기에 소수민족의 자치 및 자결 의지를 결집할 수 있었다. 1938년 발표한 마오쩌둥의 '신단계론(論新階段)'이 대표적 문헌이다. '소수 민족의 자치를 도와야 비로소 각 소수 민족이 연합하여 항일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소수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족 간 평등한 연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
얼핏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한 근대적 언어 같지만, 실상은 자치와 연합의 상호 진화를 꾀하는 제국을 계승한 것이었다. 항일을 위한 연합, 연합을 통한 항일이라는 마오쩌둥의 모순론과 실천론 또한 과거 몽골족이나 만주족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다민족 연합 통일 제국을 건설해갔던 과정과 일맥이 상통했다.
1947년 소수 민족 자치구를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이 내몽골이다. 내몽골은 공산당에는 열렸으되, 국민당에는 닫힌 공간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국공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즉,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은 만주족의 대청제국 건국 과정과 놀라우리만치 흡사했다.
만주에서 몽골로, 변경에서 중원으로. 과연 수도의 처소 또한 난징(南京)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옮겼다. 난징은 명제국과 중화민국의 수도였다. 베이징은 대원제국과 대청제국의 수도였다. 중화민국이 한, 송, 명을 잇는 중화제국이었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당, 원, 청을 잇는 유라시아제국에 가까웠다.
제국의 근대화로 중국의 내외 정책도 변경되었다. 이번원에서 관리했던 지역은 자치구가 되었다. 조공국과 호시(互市)국(유럽과 일본 등 중화 세계 밖에서 무역만 하던 나라들)은 독립국이 되었다. 소수 민족에게는 자치권을 부여했고, 주변 민족에게는 자결권을 인정했다. 1955년 반둥 회의에서 공식화된 '평화 공존 5원칙'이 상징적이다. 암묵적이었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근대적인 조약의 형태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 간 체제를 중화 세계의 내부로 수용하여 신형 대-소국 관계를 확립했다. 왕년의 상국(上國)과 하국(下國)은 더 이상 없다. 소수 민족과 주변 민족과 대동단결하여 항일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제국의 근대화'를 완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발판으로 미국과 소련에 동시에 저항하는 제3세계의 탈냉전 운동을 선도했다.
반면 항일에서 항미/항소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이 집합적 역사 운동으로부터 이탈했거나 소외되었던 국가들은 하나 같이 '속국'으로 전락했다. 몽골은 독립하자마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다. 일본과 류큐(오키나와), 대만(타이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다. 위성국(Satellite State)과 동맹국(Client State)은 하나같이 '속국의 근대화'를 경험했다. 북조선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지금껏 주권 국가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심연을 가르는 분열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제국의 근대화'와 '속국의 근대화'로 말미암은 상이한 국제 질서가 첨예하게 길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각기 '냉전'을 명분으로 근대화된 속국들을 만들어갔다.
소련의 해체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독립 국가들의 대거 등장으로 귀결되었음은 상징적이다. 그러나 그 '탈냉전'이 한쪽의 일방적인 붕괴로 도래함으로써 다른 한쪽은 여전히 속국을 해소하지 못한 병폐를 남기고 말았던 것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근대 국가에 미달한 나라들이 도열하고 있는 것이다. 목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요동치고 있는 근저라고 하겠다.
'제국의 근대화'와 '속국의 근대화'가 빚어내는 '신냉전'의 양상은 작금의 동북아가 처음은 아니다. 1980년대 동남아에서 이미 구현되었다. 지난 4월 30일은 베트남 통일 40주년이었다. 사이공의 함락으로 '도미노 이론'은 현실이 되었다. 남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순식간에 공산화되었다.
1975년 인도차이나는 온통 붉었다. 몽골이 아시아 최초의 공산 국가라면,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올 12월이면 건국 40주년을 맞는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기저를 한층 세심히 살펴보기 위해서 '붉은 라오스'가 탄생한 저간의 사정도 복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남하한다.
[유라시아 견문] 붉은 라오스 : 베트남의 서진(西進)
통일 베트남의 횡포, 붉은 라오스의 탄생
1975 : 도미노
4월 30일, '사이공'에 있었다. 정식 명칭은 호치민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공이 익숙하다. 이곳 사람들도 그렇다. 호치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쓰인다. 일상과 유리된 이름이다. 사이공을 다시 찾은 것은 올해가 통일 40주년이었기 때문이다. 현장을 지켜보고, 기운을 느끼고 싶었다.
무더위 탓에 기념행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되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TV 생중계를 보는 만 못했다. 사전에 확인된 사람들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 주변으로 차량도 통제되고, 보행로마저 막아두었다. 하노이에서 총출동한 국가 지도자들이 사이공 시민들과는 아무런 교감도 없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공보다는 하노이에 어울릴법한 각종 선전 포스터들만이 통일 40주년을 상기시켰다.
작년(2014년) 한 사진작가를 만난 일이 떠올랐다. 사이공 토박이였고, 1975년생이었다. '통일둥이'였다. 호치민 영묘에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고 내뱉는 일성이 의외였다. 순 거짓말~이란다. 내심 놀랬다. 통일 이후에 학창 시절을 났을 텐데도, 북에 대한 감정이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공식 서사와는 다른 얘기들을 주변에서 일상에서 많이 들었던 탓이리라. 통일둥이가 마흔이 되도록 남북 간 마음의 통합은 여전히 멀었다.
실제로 1975년 4월 30일을 '통일'이 아니라 '병합'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럿이다. 특히 남베트남 출신들의 회고록이 그렇다. 미국이나 프랑스로 망명한 관료들과 지식인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들의 처지와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호앙반안(Hoang van an)같은 예외적인 인물도 있다. 내가 읽었던 회고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경우였다. 그는 북베트남 출신이었다. 그것도 호치민의 최측근이었다. 초대 중국대사를 역임하며 북조선과 몽골 업무도 담당했다. 동아시아 통이었다. 그런 고위 인사가 1979년 통일 베트남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로 떠난 이들이 통일의 실상을 '병합'이라고 여겼다면, 호앙반안은 통일로 말미암아 베트남은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친소파가 득세함으로써 중국과 적대하고 동남아시아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친중파'의 치우친 독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실상과 부합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서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1975년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1945~1975년의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베트남의 주류 서사를 답습하는 편이다. 물론 한국 현대사 최대의 오점 중 하나인 베트남전 참전과 양민 학살을 반성하는 일은 소중한 작업이다. 나라의 양심을 일깨우고 나라의 품격을 세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아쉽다. 정작 베트남에는 내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20세기를 꿰차기 위해서는 1975년 이후의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차이나의 지평에서 1975~1989년의 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
우선 도미노 이론부터 전혀 틀리지가 않았다. 사이공이 무너지자, 인도차이나 전체가 적화(赤化)되었다. 베트남이 통일되던 1975년, 캄보디아(4월)도, 라오스(12월)도 공산 국가가 들어섰다. 1972년 리처드 닉슨과 마오쩌둥의 악수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흐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오류는 그 다음부터였다. 도미노 이후의 사태가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민족 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던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10년이나 점령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 전쟁까지 벌였다. 자중지란으로 사회주의 국제주의는 산산이 깨어졌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중국이 아니었다. 베트남이었다. 중국 위협론과 중국 봉쇄론에 입각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중립주의'를 부추기는 편이었다. 아세안과 협력하여 베트남/인도차이나와 적대했다.
북조선이 신중국의 위성국이 아니었듯, 북베트남 또한 신중국의 괴뢰국이 아니었다. 커녕 매우 능동적이고 야심찬 역사의 주체였다. 본디 월남과 조선은 기질이 달랐다. 소중화에 자족하는 동방예의지국과는 달리, 월남은 남쪽의 중화 제국을 자처했다. 자그만 치 1000년 전 대당제국에서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줄곧 그러했다.
하노이 근방에는 짱안(Trang An)이라는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다. 동양화풍의 절경을 감상하며 뱃놀이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그런데 알파벳을 지우면 '長安' 이라는 한자가 드러난다. 장안이 어디인가. 현재의 시안(西安)이다. 대당제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즉, 대당제국이 무너지나 그 수도의 이름을 남쪽에다 옮겨다 둔 것이다.
그만큼 호방했다. 실로 월남은 1000년을 그치지 않고 제국 건설을 추진했다. 20세기도 다르지 않았다. 끝끝내 라오스인민공화국이라는 세계 유일의 불교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1975년 12월, 20세기 최후의 공산 국가였다.

▲ 베트남 전쟁을 승리한 통일 베트남은 소련의 위성 국가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자를 자처했다. 베트남은 라오스를 20세기 최후의 공산 국가로 만들었다. ⓒtvN
인도차이나 :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19세기부터 그랬다. 현재의 베트남 영토를 최초로 통일한 응우옌 왕조가 들어서자 '문명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동남아시아의 유일하고 예외적인 유교 국가, 중화 문명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넘쳐흘렀다. 통일 이후에는 남쪽의 크메르, 서쪽의 라오스로 눈을 돌렸다. 양국을 '夷(오랑캐)'로 여기고 황제의 교화와 감화로써 개조하려 들었다.
1834년 크메르를 복속시킨 이가 민망 황제이다. 허나 대남제국은 대청제국과도 달랐다. 불교 국가의 자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식 관료제를 곧장 적용했다. 의복과 언어, 사상, 종교까지 바꾸려 했다. 일종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을 꾀한 것이다.
오래 가지는 못했다. 크메르에서 철수한 것은 1847년이다. 야심은 넘쳤으되 힘이 모자랐다. 실제로 월남은 시암과 버마에 견주어도 압도적이지 못했다. 대청제국과 같은 보편 제국에는 못 미쳤다. 동남아의 다중심 가운데 하나, 만달라 세계 질서의 일부였다.
제국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닦아준 것은 역설적으로 프랑스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아래서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진출했다. 프랑스의 '문명화 사업'이 월남의 문명 의식과 묘하게 공명했다.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1945~1954년)에서도 프랑스와 베트남은 적수였으되, 각기 서로 다른 인도차이나 건설의 책무를 자임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한국 전쟁 발발도 기회로 여겼다. 인도차이나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로 혁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호기로 삼았다. 그들은 이것을 '국제적 임무(Nhiem Vu Quoc Te)'라고 불렀다.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가장 근대적이고 혁명적인 국가임을 자부했다.
인도와 버마, 인도네시아 등은 이런 (북)베트남을 우려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베트남이 주도하는 인도차이나 및 동남아시아의 공산화에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아니 결단코 반대했다. 총대를 멘 것은 인도의 네루였다.
네루는 버마의 우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의견을 나눈 뒤, 중국의 저우언라이에게 의견을 전했다. 1954년 6월, 뉴델리 회동에서였다.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도차이나 서부에서 (북)베트남군을 철수시키라고 요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우언라이는 인도차이나 사정에 어두웠다.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네루는 인도와 버마에 비유했다. 영국령 식민지라는 공통점은 있었으되 양국이 엄연히 별개의 국가이듯,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또한 별개의 국가라고 했다. 인도차이나는 어디까지나 식민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네루의 견해는 명쾌했다. 남/북 베트남의 통일은 지지하되,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중립주의 또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는 성원을 보내되, 베트남의 제국주의적 행보 또한 제어하겠다는 뜻이다.
저우언라이는 설복되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독립 및 중립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국이 버마처럼 비동맹 노선을 걷는 '신형 동남아 국가'가 되기를 바랐다. 동남아에서 가능한 많은 중립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이 미/소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여겼다. 이듬해 반둥회의(1955년)로 가는 길목이었다.
호치민도 수긍했다. 그래서 제네바 조약(1954년)이 타결된 것이다. 프랑스군과 더불어 베트남군도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호치민보다 한 세대 아래는 불만이 컸다. 혁명적 열정에 불타오르는 '신청년'들이었다. 인도차이나 혁명의 꿈을 버릴 수 없었다. 호치민을 '민족주의자'로 깎아내렸다. 호시탐탐 기회도 엿봤다.
2004년 출판된 쭈휘만(Chu Huy Man)의 회고가 흥미롭다. 라오스 혁명에 깊숙이 개입한 베트남 고문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라오스로 파견되기 전 호치민과의 독대 장면이 나온다. 호치민이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의 친구인 라오스인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친구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을 베풀어라. 결국은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 또한 '자력갱생'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쭈휘만은 호치민의 충고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고, 현장서도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과연 호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호에 대해서는 원체 사후 각색과 윤색이 많기 때문이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의 뜻이 실제로 옮겨진 것 같지도 않다. 당장 쭈 본인의 회고만 보더라도 베트남의 주도성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임무'와 최종적 승리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기층 단위에서 전개되었던 실천 양상까지 매우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헌신적인 베트남 혁명가들의 기록을 보노라면 마치 19세기 프랑스의 선교사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들은 혁명 사상을 전수하기 위하여 라오스 언어를 직접 배우고, 산간에 사는 소수민족 언어까지 학습했다. 어학 교재를 출판하고, 특수 학교도 세웠다. 라오스에서 '국어'가 전국 곳곳, 고산지대까지 보급될 수 있었던 것도 열정적인 베트남 혁명가들 덕분이었다.
철저한 '하방'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었다. 현지인들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고, 피부를 더 검게 태우고, 라오스 식이나 소수 민족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지인과 결혼을 하거나, 마을 촌장의 양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라오스인들을 '붉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자 했던 것이다. 실로 베트남은 식민모국에 맞서 군사적으로 승리한 세계 유일의 국가였다. '베트남의 길'이 곧 라오스의 미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언뜻 한 세기 전 대남제국의 문명화 사업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민망 황제가 도모했던 '교화'의 반복이고 심화처럼도 보인다. 문명화가 근대화, 혹은 혁명화로 바뀌었을 뿐이다. 100년 전과 달리 물리력도 갖추어졌다. 프랑스가 건설한 교통망이 있었고, 소련과 중국에서 전수받은 군사력도 있었다. 평지에서 산지까지 더 높이, 더 깊이, 더 널리 베트남의 영향력이 침투한 것이다.
여기에 선교사적 혁명가들의 열정이 결합하여 '붉은 라오스'가 탄생했다.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시암과 월남 사이에서 이중 조공을 하며 균형을 취했다.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불교 국가인 시암에 더 가까웠다. 라오스의 근대화 또한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태국(타이)식 모델을 따랐다. 그러나 베트남 혁명가들의 '국제적 임무'로 말미암아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의 단독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다. 20세기 동남아시아사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간의 '특별한 우의(Tình Hữu Nghị Dặc Biệt Việt-Lào)'를 체현한 인물이 카이손 폼비한(Kaysone Phoumvihan)이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첫 총서기이자, 라오스인민공화국 초대 수상이 되었다. 1920년생으로 어머니가 라오스인, 아버지가 베트남인이었다. 어릴 적부터 하노이에서 유학하여 베트남어도 유창했다. 이처럼 인민혁명당의 주요 간부들이 혈연과 학연으로 하노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1975년 이후에도 사상 및 이론 학습을 담당하는 당 간부 교육은 하노이에 있는 응우옌 아이 꾸억(호치민의 아명)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북의 군사 물자를 남으로 이송했던 호치민 루트가 괜히 라오스를 지났던 것이 아니다. 호치민 루트는 통일의 길이자 혁명의 길이었고, 또 제국의 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베트남은 미국이 그러했듯이 라오스의 운명을 라오스인의 손에 맡겨둘 의사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라오스 왕정을 도와 국군을 양성했고, 베트남은 인민혁명당을 지원하여 혁명군을 양성했다. 제네바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전개된 이 북베트남의 비밀공작이 당시 소련과 중국에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미지수이다. 내 판단으로는 베트남의 독자 행보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사회주의 국제주의'의 실천보다는 '대남제국'의 현대적 계승에 가까웠다.
1977년 통일 베트남과 '붉은 라오스' 간 조약이 체결된다. 소련과 동유럽에 방불한 비대칭적 동맹이 공식화되었다. 따라서 국가 간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왕년의 조공국을 내부로 편입시킨 것에 가깝다. 이로써 베트남은 라오스의 외교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등 내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었다. 5만 명의 베트남군이 주둔하며 사회주의적 개조를 진두지휘 했다.
1979년 베트남은 캄보디아까지 점령했다. 이로써 베트남이 축이 되어 라오스/캄보디아를 하위 파트너로 거느리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s)도 완성되었다.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속국의 근대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소련이었다. 1979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해이기도 하다.
미군이 떠난 남베트남에도 소련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통일 베트남이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어간 것만큼이나, 인도차이나에도 동구형 질서가 이식된 것이다. 차이라면 프랑스/베트남(우파) 연합의 인도차이나에서 소련/베트남(좌파) 연합의 인도차이나로 전환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붉은 대남제국'을 저지하고자 동남아 국가들이 합심하여 등장한 조직이 바로 아세안이었다. 인도차이나 대 아세안, 1980년대 동남아의 '신냉전' 구도였다.
아세안 : 우정의 다리
동유럽과 동남아의 탈냉전은 동시적이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철수할 무렵, 베트남도 캄보디아/라오스에서 철군했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확대되어간 것처럼, '인도차이나연방'이 해소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도 확산되었다.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이 독립 국가로 전환되었듯, 라오스와 캄보디아 또한 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한 것은 1995년이다. 1945년 독립으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마침내 제국 건설의 기획을 접고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오스 또한 해방 공간으로 돌아갔다. 10년간 탄압받았던 소승 불교가 되살아났고, 독립 초기에 추구했던 비동맹 중립 노선을 복구했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취하고 있다. 아세안에 가입한 것은 1997년이다. 중국, 베트남, 북조선과 함께 현존하는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들로서의 연대를 지속하되, 아세안의 구성원으로서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 태국과 라오스를 가르는 메콩 강에 '우정의 다리'가 세워졌다. 1980년대 양국의 국경은 신냉전의 최전선이었다. 인도차이나와 아세안이 메콩 강을 사이로 길항했다. 이제는 딴 판이고 새 판이 열렸다. 동남아에서 바다를 면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 국가라는 특성이 라오스를 동남아 교통망의 허브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래서 어떠한 통신망과 교통망도 라오스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운남성과도 국경이 닿는다. "5국 1성(五國一省)"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역 경제권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운남성 쿤밍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까지 가닿는 고속철 또한 루앙푸라방과 비엔티엔 등 라오스의 주요 도시를 거친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메콩 강은 티베트 동부에서 발원한다. 운남성을 지나 동남아 주요 국가를 돌고 돌아 남중국해로 흘러나간다. 길이로는 세계 12번째, 수량으로는 세계 10번째에 꼽힌다. 20세기 메콩 강은 식민과 전쟁의 상징이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의 분단선이기도 했다. 21세기는 동남아를 통합하고 중국 남부까지 잇는 평화의 물줄기가 되고 있다.
'우정의 다리' 건설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와 태국 사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도 '우정의 다리'가 생겼다. 그리고 이 다리들은 다시 아세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중국 남부와 동남아 내륙을 종횡으로 엮는 '1일 생활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중국해가 부쩍 소란해졌다고는 하지만, 메콩 강에서 일고 있는 이 도저한 변화의 물결이 쉬이 꺾일 성 싶지는 않다. 강물이 흘러 바닷물이 될 것이다.
제국과 속국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일원이 되었다. 라오스는 베트남의 속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의 일국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된 탈냉전의 양상이다.
동아시아 냉전은 양분이 아니라 삼분이었다. 미국-동맹국, 소련-위성국, 중국-주변국의 삼분 세계였다. 서구와 동구, 동방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동구와 서구는 다른 듯 닮은 구석이 있었다. 공히 '속국의 근대화'가 전개되었다. 조공국이 식민지를 지나 동맹국/위성국으로 낙착되었다. 주권 국가, 독립 국가에 미달했다.
반면 속국을 해소해가는 역사 운동도 있었다. 중화 세계의 상/하국 관계를 대/소국 관계로 재편시켜가는 또 다른 근대화였다. 제국을 근대화하여 국가 간 체제에 적응시킴으로써 속국의 자립과 자결을 확보해간 것이다. 소수 민족에게는 자치권이, 주변 민족에게는 자결권이 부여되었다. 나는 이 100년의 역사 운동을 '중화 세계의 근대화'라고 표현한다.
즉, 동아시아의 20세기를 '중화 체제에서 국가 간 체제로의 전환',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의 전환'이라고 갈음하는 것은 몹시도 미흡한 진술이다. 명과 실이 부합하지 않는다. 실사구시에 어긋난다.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동북아의 중화 세계와 동남아의 만달라 세계를 구성하는 복합계의 일부로서 국가 간 체제를 포용/포섭해간 과정이었다고 보는 편이 한층 적실하다.
그 과정에서 실로 다양한 발상들이 제출되었다. 두 사람만 꼽는다. 청말 사상가 장삥린은 몽골과 신장, 티베트, 만주는 독립시켜도 무방하다고 했다. 애당초 중원과는 문명이 다른 지역이었다. 반해 조선과 월남, 류큐를 편입시키고자 했다. 유교 문명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즉, 중화 문명을 계승한 국가끼리 협동하여 '대중국'을 이룸으로써 국가 간 체제에 들어가고자 했다. 번부를 독립국으로, 조공국을 제국의 내부로 삼는 기획이었다.
반면 민국 초기, 청년 마오쩌둥은 각 성들이 모두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동국, 산동국, 복건국 등 소중국으로 자립자강 하자고 했다. 각자도생, 자력갱생하여 차후에 '중화연방공화국'으로 합치자는 것이다. 전자는 '대국주의적 발상'이고, 후자는 '소국주의적 발상'일까.
쉬이 단정하기 어렵다. 각자 그 나름으로 국가 간 체제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있었을 뿐이다. 즉, 만국공법으로 전수된 유럽형 세계 질서를 중화 세계의 어느 단위에서 어떤 수준으로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집합적 과제가 있었다.
21세기 하고도 1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완수되지 않은 숙제이기도 하다. 나는 이 못다 이룬 과제가 목하 동아시아를 짓누르는 '신냉전'의 망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긴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핵심 모순도 여기에 있다. 좌우 체제 대결도, 미중 패권 경쟁도 아니다. '미국식 조공 체제'와 '중국식 국가 간 체제'가 길항하고 있다. 신형 상-하국 관계와 신형 대-소국 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동과 서가 뒤집어졌다. 서구가 '봉건적'이고, 동방이 '근대적'이다. 역사의 커다란 역설이다.
[유라시아 견문] 북경 : 제국의 터전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흥할까?
북경과 대도
내몽골에서 베이징(북경)으로 향했다. 고비 사막을 낀 내/외몽골에 견주면 거리가 훨씬 가까웠다. 밤기차를 타서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오래된 길이었다. 지금은 철길이지만, 한창 때는 말이 달리던 길이다. 그 길을 따라서 몽골은 중원을 장악했다.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했다.
만주족도 이 길을 따랐다. 내몽골에서 북경으로 내쳐감으로써 대청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다. 동북 3성(만주)과 내몽골에서의 승기가 결정적이었다. 애초 북경을 '大都(대도)'로 이름 짓고 처음으로 수도로 삼은 이도 쿠빌라이였다. 중원에서 보자면 동북으로 치우친 장소지만, 유목민이 보기에는 북방과 중원의 딱 중간이었다. 북경은 진정 제국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북경으로 가는 밤기차에서 북방의 1000년사가 복기되었다.
3년 만이었다. 날씨가 무척 화창했다. 5월의 하늘이 몹시 파랬다. 3년 전 베이징의 겨울은 스모그가 자욱했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가 했더니, 특파원들 말씀으로는 그건 또 아닌 모양이다.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덕분에 드높은 창공을 바라보며 '제국'을 깊이 궁리해 볼 수 있었다. 사색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본디 중화 제국에서 하늘은 각별했다. 제국의 정통성이 '天命(천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경탄한 이는 라이프니치였다. 중화 제국을 규정해간 초월적 '천'의 관념에 감탄했다. 황제는 절대군주가 아니었다. 하늘에 의해 심판받는 존재였다. 관념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사관을 통하여 제도화했다. 사마천의 <사기> 이래 일관되었다. 역사 편찬이 갖는 의의가 변하지 않았다. 중화 제국이 연속성을 갖는 것도 천명이라는 발상과 사관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아시아였다면 '제국의 교체'라고 보였을 일들이, 동아시아에서는 동일 제국 안에서의 '왕조의 교체'로 간주되었다. 가령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했음에도 양자를 연속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페르시아 제국은 '동양'으로, 로마 제국은 '서양'으로 표상되기 일쑤이다. 오스만 제국의 칼리프가 로마 황제를 자처했다는 사실도 곧잘 무시된다.
그에 반해 진과 한은 중화 제국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사관 때문이다. 사관이 체현하는 천명 때문이다. 천주 문명과 천명 문명이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한쪽은 제국이 붕괴되고 신앙 공동체(중세)와 신념 공동체(근대)로 쪼개져가는 1000년사를 경험했고, 다른 한쪽은 제국을 끊임없이 복원해가는 1000년사로 나뉘었다. 20세기 100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국의 탄생
세계 4대 문명권이라는 말이 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싶다. 수전(논농사)에 기초한 장강 문명과 화전(밭농사)에 근거한 황하 문명은 엄연히 별개의 문명이었다. 즉 고대 문명은 5대 하천에서 비롯되었다. '5대 문명권'이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양대 문명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가 진나라였다. 황하 문명과 장강 문명을 통합했다. 가히 제국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관건은 제국의 건설이 아니라 제국의 유지이다. 말 위에서 제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국을 경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제국은 생산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사상'이 필요하다. 인간을 다스리는 기술, 인간의 마음을 사는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복수의 공동체=국가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德(덕)'을 실현해야 했다. 안정과 평화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시장 확대와 물질문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면 문화도 융성해진다.
중화 제국의 남다름이 여기에 있다. 덕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 대국이었다. 제국 경영의 사상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난상토론 끝에 제자백가가 도달한 제국의 경영술은 일치했다. '無爲(무위)'이다. '무위'란 '(인)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위'는 힘에 의한 강제이다.
당시로서는 크게 둘이었다. 하나는 주술에 의한 강제, 즉 씨족 사회의 전통이다. 다른 하나는 무력에 의한 강제이다. 씨족 사회(원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군사력, 즉 패도였다. 작은 공동체는 종교가, 큰 공동체는 완력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다.
'무위'는 양자를 모두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위'란 도가뿐만이 아니라, 유가도 법가도 공통된 지향이었다. 주술과 무력에 의거하지 않기, '사상'의 힘으로 제국을 다스리기. 철학 왕국, 인문 국가를 지향한 것이다.
공자는 이것을 인과 예로써 풀었다. 한비자는 법으로써 접근했다. 법가의 법치주의 또한 피지배자를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다.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지배자를 법으로 구속하자는 것이다. 법이야말로 지배자를 복종시키는 수단이었다. 그러하면 자연스레 신하도, 백성도 법을 따르게 된다. 법가가 추구한 '무위'이다.
法(법)은 Law(법칙)이 아니다. 물처럼 자연히 흐르는 것(水+去)이다. 복수의 공동체 간의 담을 허물고 벽을 부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법이다. 부족 사회나 씨족 국가를 넘어선 영역에서 통용되는 '만민법'인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법'이란 애당초 '국제법'에 가까웠다.
다만 문화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이른바 화/이의 분별이다. 사람에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듯이, 국가에도 문명국과 야만국의 분별이 있었다. 하지만 차별만도 아니었다. 화/이의 분별이야말로 중화 제국이 늘 다른 문화와 문명을 포섭하는 복합 국가였다는 증거이다. 아니 화/이의 변증법이야말로 제국의 진화를 추동시키는 내적 동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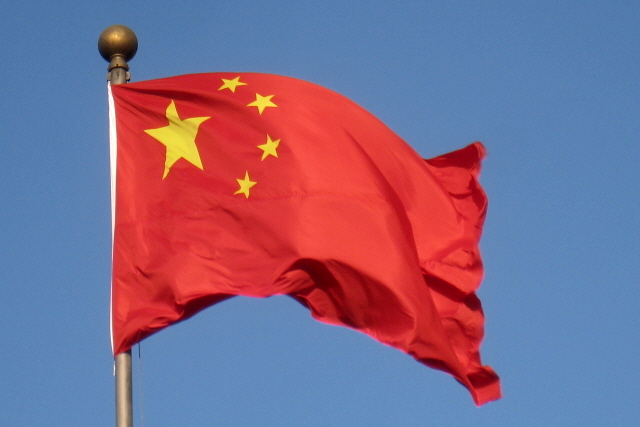
화/이의 변증법
한나라는 흉노로 고민했다. 무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제도, 즉 문화가 모자랐다. 유목민을 포섭하는 원리를 미처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을 실현한 것이 당이다. 그래서 대당제국이라는 표현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 이행 과정이 흥미롭다. 한과 수/당 사이에 소위 '5호 16국' 시대가 있었다. 변경에 있던 유목민들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지냈던 시절이다. 이 난세에 마침표를 찍은 나라가 선비(탁발씨)의 북위였다. 북위는 유목 국가이면서 동시에 농경 국가이기도 했다. 투르크계의 흉노나 위구르와 달리 한나라의 문명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 중앙 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고 균전제도 도입했다. 복합 국가, 제국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다.
이러한 북위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 수와 당이었다. 수도, 당도 북위의 장수가 만든, 즉 유목민이 세운 왕조였다. 그래서 수당 제국 또한 외연의 확대에 그치지 않았다. 외부에 있던 것이 내부화되는 과정, 즉 주변이 중심이 되는 화이변태의 과정을 밟았다.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다. 남방과 북방의 문화가 뒤섞였다. 남방의 불교가 국교가 되고, 승려가 관료가 되었다.
실은 불교의 국교화를 가장 먼저 이룬 나라도 북위였다. 화/이를 융합시키는 복합 국가의 원조였던 것이다. 그래서 문화의 전파력도 한층 커질 수 있었다. 중원의 밖으로 수당의 제도가 널리 퍼져나갔다. 삼국 및 월남, 일본에 이르기까지 광역대의 중화 세계가 형성되어갔다. 전례가 없는 세계 시민주의도 만개했다. 당나라는 골수(骨髓)가 제국이었다.
대당제국의 해체 이후에도 제국의 이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농경 국가와 유목 국가, 중원과 북방의 통합은 중화 제국사를 규정한 핵심 과제였다. 이 과제를 한층 더 잘 계승한 쪽은 송나라보다는 거란이었다. 남송은 유목 국가적 성격을 거의 상실했다. 반면 916년 거란을 세운 아리츠아보키(耶律阿保機)는 제국을 복원하려 했다. 북방의 유목 세계에 농경 국가의 원리를 재차 도입하려 한 것이다.
물론 반발이 적지 않았다. 군사력의 우위에도 내부 분란으로 남송을 치지 못했다. 결국 거란은 무너졌지만, 제국 재건의 목표는 초원 세계로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결국 중원으로 회귀했다. 몽골이 건설한 대원제국이 비상했다.
북방에서 제국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시도가 거듭되고 있을 무렵, 남방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창이었다. 수당 제국의 열린 세계가 닫히면서 사상의 엄밀화와 질적 도약이 일어났다. '송학'의 등장이다.
불교를 품어낸 신유학이 탄생했다. 과거제도 본격화되었다. 지배자의 자격이 만인에게 개방되었다.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고, 누구도 사대부가 될 수 있었다. 신분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종교 사회에서 인문 사회로. 동방의 계몽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그 파장으로 가까이로는 정도전의 <불씨잡변>이, 멀리로는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등장했다. 전 지구적 계몽화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초원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과는 달리 중원까지 통합한 쿠빌라이는 중국의 황제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방의 대칸이 남방의 천자가 되기 위해서 남송에서 심화시킨 천명 사상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대의 주자는 끝내 이단으로 생을 마쳤으되, 몽골제국에서 주자학은 국학으로 격상되었다. 다국가, 다문명을 통섭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합리주의(=실학)가 아니고서는 제국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거제가 주변으로 확산된 것도 몽골을 통해서였다. 당장 고려에 과거제가 도입된 것도 몽골의 영향이다. 결국 그 과거제를 국가의 골간으로 삼아 조선이라는 문명 국가도 들어섰다.
이 세련된 소프트웨어는 몽골세계제국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하여 중화 세계 밖으로도 수출되었다. 아랍으로, 유럽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결국 유라시아의 가장 서편에서도 절대군주의 목을 치는 하극상이 일어났다. 화에서 이로, 중원에서 주변으로, 동방에서 유라시아로, 중화제국의 이상이 확산된 것이다. 송학의 서진, 맹자의 세계화라고도 하겠다. 화/이의 변증법이 중화 제국의 경계를 넘어 유라시아의 사상과 제도의 근대화를 추동했던 것이다.
중국몽과 제국몽
지난 3년 사이 중국은 정권이 바뀌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
눈에 띄는 변화는 거리의 선전물이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곳곳에 널려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 이데올로기쯤 되겠다. 열 두 개의 핵심 가치를 셋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국가의 목표로서는 '부강, 민주, 문명, 화해(조화)'가, 사회의 목표로서는 '자유, 평등, 공정, 법치'가, 개인의 목표로서는 '애국, 경업(敬業), 성신(誠信), 우선(友善)'이 꼽힌다.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전송했더니, 한 후배가 '자본주의 국가와 차이가 없네요.' 라고 답한다. 농이었지만 진을 담았다. 아니, 정답이었다. 좌/우의 시대는 일찌감치 지났다. 중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 '100년의 급진'을 뒤로 하고, '중국의 길'을 걷는다. 20세기의 東京(동경)과 21세기의 北京(북경) 사이의 결정적 차이이다. 중국은 끝끝내 '탈아입구'하지 않았다. 중심을 잃지 않고, 본연도 잊지 않았다. 자력으로 갱생했다. 근성이고 저력이다. 거듭 재귀했던 중화 제국도 결국 귀환하고 있다.
하여 중국에 필요한 것은 '서구화'도 '민주화'도 아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중화 제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더욱 진화시키는 것이다. 제국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재구축하고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 특색의 '古今(고금)합작' 프로젝트라고도 하겠다.
혹여 중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다면, 십중팔구 전국 시대가 재연될 것이다. 소수 민족이 독립하고, 한족도 지방별로 갈라설 것이다. 국민 국가를 萬國(만국)과 萬世(만세)의 표준으로 삼는 외눈박이라면 그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발전'과 '진보'는 난세를 가리(키)는 20세기의 최신 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구한 중화 제국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어디까지나 어지러운 시대에 그칠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야기하는 정권은 결코 민의의 지지도 얻을 수가 없다. 천명에 기초한 정통성을 도무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래 지속될 리도 없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파국적 재앙만 선사할 것이다.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대청제국의 말기를 잠시 상기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대청제국이 근대국가가 되고자 함으로써 천하대란은 더욱 극심해졌다.
돌아보면 국가 간 체제는 전형적인 난세의 논리였다. 독립과 평등이라는 허상이 세력 균형이라는 끊임없는 경쟁과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했다. 그에 비해 중화 제국은 연비가 훨씬 뛰어난 체제이다.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적이다. 녹색 시대에 더욱 어울린다. 백번 양보해도 중화 제국의 실현이 태평성세의 충분조건은 아니었으되, 치세의 필요조건이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서방의 이론보다는 동방의 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천안문 광장에 서서 자금성을 바라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곰곰이 새겨본다. '중화 문명의 인민화'가 가능할 것인가? '인의예지의 공화국'이 들어설 것인가? 건국 100주년(2049년)이면 '중화 제국의 근대화'도 일단락될 것인가? 마침 천안문 일대로 또 다른 선전 포스터들이 보인다.
"中華文明 生生不息(중화문명 생생불식)." "大德 中國(대덕 중국)."
이 나라는 이미 元氣(원기)를 되찾고, 原理(원리)를 되살리고 있다. 오만한 자만심보다는 떳떳한 자부심이길 바란다. 왕도를 구현하고, 대덕을 발휘하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그래야 천하 또한 태평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견문] 몽골의 후신 : 대청제국과 오스만제국
로마와 몽골의 후계자 오스만은 왜 몰락했나?
포스트 몽골 시대
베이징에서 하노이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몽골에서 베트남까지, 북방에서 남방으로, 동아시아를 종단하는 셈이다. 그 길은 정확하게 몽골족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하노이에는 몽골군에 맞서 승리했던 쩐흥다오(Trần Hưng Ðạo)를 기리는 유적이 여럿이다. 이순신에 빗댈 만한 성웅으로 높이 떠받는다. 헌데 이 길이 옛 길만은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장장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지만, 고속철이 완성되면 한나절로 줄어든다고 한다. 동북아와 동남아가 하나의 생활 세계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一帶一路(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구현해갈 미래상 또한 점점 더 몽골세계제국의 그것과 겹쳐 보인다. 왕년의 역참제가 고속철과 고속도로,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 몽골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9세기 이래 서구의 굴기는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단막극이었다는 실감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중화 세계에서 만다라 세계로 남하하면서 대륙의 풍경은 다채롭게 변주되었다. 풍광만은 미국도 못지않다. 장쾌하고 수려하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동방에는 저 풍경 사이로 人文(인문)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자연사와 인류사가 포개져 있다. '구대륙'이 보유한 위대한 유산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500년에 새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유럽의 근대'가 돌출하기 이전의 '유라시아의 초기 근대'에 눈길이 가는 것이다. 몽골세계제국이 중요한 것은 13세기에 유라시아 전역을 통합했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그 이후에도 세계 각지마다 몽골의 유산을 남겨두었다는 점이 관건이다.
실제로 유라시아 각지의 후계 정권들은 칭기즈칸 이래의 혈통과 전통을 존중하고 몽골적 요소를 계승했다. 무엇보다 광역적 통합(=제국)의 지향이 지속되었다. 물론 장소마다 그 역사적 실상에는 층차가 있었다. 대별하자면,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나눌 수 있겠다.
서유라시아와 동유라시아
서유라시아에서 몽골의 유산은 이슬람과 혼합되었다. 아랍인의 이슬람 또한 광역적 통합망을 구축하는 또 하나의 보편적 기획이었다. 그 이슬람의 소프트웨어가 몽골세계제국의 하드웨어와 결합함으로써 페르시아어를 보편어로 삼는 '페르시아 문화권'으로 성장해 간 것이다. 이 페르시아 문화권은 몽골과 이슬람이라는 양대 보편성의 통섭이었다. 남아시아에서 굴기한 '무굴'제국(16~19세기)이 상징적이다. '몽골'의 후예이자, 이슬람제국이었다.
헌데 서유라시아에는 또 하나의 보편적 기획이 있었다. 로마이다. 흔히 로마라고 하면 그리스-로마를 떠올린다. 그리스-로마의 전통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근대 서구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자란 진술이다.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근대 역사학이 주조해낸 편향된 '신화'에 가깝다. 역사 쓰기는 늘 기록이자 망각인 법이다.
실제로는 로마의 유산은 크게 셋으로 갈라졌다. 서로마의 후계자인 서유럽, 로마제국의 정통이었던 동유럽, 그리고 동구의 영토를 점점 잠식해간 이슬람. 즉 서구의 가톨릭적 로마, 동구의 정교적 로마, 서아시아의 이슬람적 로마로 삼분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3번째, 즉 이슬람적 로마가 몽골의 유산과 결합해갔다.
동유라시아는 어떠했나. 동유라시아의 몽골은 라마 불교와 결합했다. 서유라시아의 이슬람에 빗댈 수 있겠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거기까지였다. 그 다음은 전혀 달랐다. 우선 인접하는 한자 및 유교 문명과는 융합이 덜했다. 몽골세계제국에서 떨어져 나온 명나라는 몽골적 요소를 배제하고, 주자학과 화이질서라는 전통적 유교 이념을 체제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조선과 류큐 등 호응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다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즉 동유라시아에는 서유라시아가 공유했던 '로마'의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서북의 몽골, 티베트 권역과 동남부의 한자 및 유교 문명권이 근 300년간 분립하는 형태가 이어졌다. 두 개의 보편성이 일체화되기보다는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포스트 몽골 시대, 유라시아의 동과 서에서 최대치의 통합을 실현했던 두 제국, 오스만제국과 대청제국의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로 입성하는 마호메트2세.
오스만제국과 대청제국
오스만제국의 술탄은 이슬람의 칼리프였고, 유목민의 지도자인 대칸이었으며, 동로마제국의 후계자인 황제이기도 했다. 몽골과 결합한 이슬람적 로마가 발칸반도 동쪽의 정교적 로마까지 통합한 구조였다. 몽골+이슬람+로마라는 중층적 보편성을 실현한 제국이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광대한 영역을 600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다.
그에 견주어 대청제국은 몽골+라마 불교+한자 및 유교 문명이라는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마 불교와 일체화된 만주족의 대칸이 한자 문명권의 천자도 겸직한 꼴이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었다. 양 제국 공히 '중층적 보편성'을 구현했으되, 그 중층의 구체적 실상은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스만의 경우에는 융합이고 혼종이었다. 오스만제국의 군주는 무슬림 신민에는 술탄이요 칼리프이고, 정교도 주민에게는 로마 황제라는 식으로 개별적이지 않았다. 어느 쪽에 대해서도 술탄이자 대칸이며 황제였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슬람의 법제부터 이교도를 포용하는 유연성을 품고 있었다. 때문에 기독교도를 통치하는 별개의 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슬람 군주가 이교도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란 이 오스만적 보편성이 해체되고 만 20세기의 '발명'이자 '창조된 전통'에 가깝다.
오스만제국 아래 살아가는 다양한 신민들은 그 종교나 속성에 따라 거주지를 따로 하지도 않았다. 모자이크처럼 지리적 혼주가 일상적이었기에 지역별로 통치 방식을 달리할 이유가 없었다. 주민들은 제각기 오스만 군주의 정체성을 각자 해석하고 수용하면 그만이었다. 정교도라면 '로마 황제'라는 감각이 강했을 것이고, 무슬림이라면 술탄과 칼리프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동부의 유목민들은 몽골과 투르크를 계승한 대칸의 측면을 주목했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대청제국은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보편성을 구사했다. 오스만과 같은 융합과 혼종은 일어나지 않았다. 만리장성의 북쪽과 감숙성과 사천성 서쪽으로는 라마 불교와 일체화된 몽골 기원의 유목적 전통 위에 군림했다. 그곳에는 유교는 물론 한자마저 침투하지 않았다. 만리장성 이남은 별 세계였다. 유교 사상과 화이질서가 그대로 온존했다. 오스만제국이 용광로(Melting Port)였다면, 대청제국은 샐러드 접시(Salad Bowl)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러한 양 제국의 차이는 20세기 국민 국가로의 이행과 그 궤적이 상이해지는 바탕이 되었다.
서구의 충격, 일본의 충격
유라시아에서 중층적 보편성을 구현했던 양대 제국과 유독 동떨어진 지역이 있었다. 서유라시아에서는 서유럽이었고, 동유라시아에서는 일본이었다. 유라시아의 초기 근대를 해체해가는 20세기의 주역들이었다.
서유럽의 기원은 샤를마뉴의 서로마제국 부흥과 가톨릭의 자립에 있다. 서유럽도 로마성을 분점했다는 점에서 동유럽이나 서아시아와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샤를마뉴 제국=가톨릭 권역은 그 협소한 범위 안에서 왕후와 교회가 분립하여 분쟁을 거듭하는 예외적 역사를 밟았다. 소위 '서양사'의 전개이다. 몽골세계제국이 구축한 보편성의 사례를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기독교-이슬람 전쟁)과 종교 전쟁(신-구교 전쟁)을 경유하여 국가 간 체제를 산출했다. 베스트팔렌 체제라는 것도 가톨릭 세계의 내부에서 신교-구교 간 왕후의 상호 관계를 재규정하는 것에 그쳤다. 루이 14세의 공언처럼 '짐(군주)이 곧 국가'였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외적이고 국지적인 체제가 19세기 산업혁명을 엔진으로 삼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유라시아의 한 귀퉁이에서나 통용되던 관념과 법제, 행동 양식(=외교)이 압도적 무력을 내세워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간 것이다. 유라시아의 보편 제국들이 유럽형 국민 국가들로 쪼개져갔다. '장기 20세기' 혹은 '단기 근대'였다.
굴기한 서유럽은 무엇보다 이웃한 오스만제국이 향유했던 '로마성'부터 강탈했다. 그래야 서유럽이 진정한 로마의 후예라는 대서사, '서양사'가 구축될 수 있었다. 서구 열강이 점점 더 정교적 로마의 동유럽으로 진입해 감으로써, 오스만은 갈수록 '이슬람 국가', 나아가 '투르크 국가'로 축소, 순화되어갔다. 달리 말해 '비로마화', '비문명화', '아시아화'가 전개된 것이다.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의 구축이다.
이렇게 '이슬람적 로마'를 체계적으로 부정해 감으로써 동유럽의 여러 민족들도 로마성을 박탈당한 '투르크'를 타자로 여기게 되었다. 스스로를 로마=비잔틴의 후계자로 여기며 고토(故土)를 회복해야겠다는 '민족의식'도 촉발되었다. 민족 문학, 민족 사학, 민족 자결주의가 들불처럼 번졌다. 그럼으로써 중층적 보편성을 구현했던 오스만제국은 산산이 쪼개지고, 동유럽과 중동 또한 국가 간 체제로 재편되었다. 신앙 공동체(신정국가)와 신념 공동체(민족국가) 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여 100년이 넘는 전국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그 난세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서유럽을 대체한 것은 중화 세계의 외부에서 '쇄국' 상태로 있었던 일본이었다. 일본의 위치와 역할은 실로 특이했다. 문자 생활 면에서는 한자권에 속해 있으되, 대청제국이 구현한 중층적 보편 세계에는 귀속되지 않았다. 일상생활부터 집단의 조직 방식, 대외 관계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무척 드물었다.
유학을 정치,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삼지도 않았을 뿐더러, 번부나 조공, 호시 등을 통하여 중화 세계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몽골적인 전통을 존중하는 유목 문명과도 무연했으며, 라마 불교도 신봉하지 않았다. 일종의 국외자였던 것이다. 19세기까지도 '만세일계'의 천황이 존재하고,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무사 정권'이 존속했다는 예외성이 상징적이라고 하겠다. '한-중-일'을 동아시아로 묶는 관습적 발상 또한 20세기 '東亞'(동아)의 흔적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과연 서구와 유사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 이래 더욱더 서구와 근사(近似)해졌다. 근대화/서구화의 선봉으로서 일본은 중화 세계와 대치하고 적대했다. 특히 서구에 근사하면서도 한자를 사용한다는 이중적 위치가 중화 세계를 내파해가는 주체로 등극시켰다. '독립', '문명', '개화', '중화주의' 등 번역과 오역과 창조의 주체였다.
하여 19세기 말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갈등 또한 단순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지정학적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그 심층에서 유럽과 이슬람 사이의 '문명의 충돌'과도 유사한 면모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즉 몽골세계제국이 구축했던 보편성의 안과 밖, 유라시아의 내부와 외부가 길항하고 있는 것이다.
서역(西域)과 서부(西部)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오스만제국은 파산했다. 국민 국가로의 이행에 실패했다. 투르크의 국가, 터키로 쪼그라들었다. 그럼으로써 무수한 국민 국가들이 파편처럼 파생했다. 발칸과 중동 문제의 기원이다.
반면 대청제국의 경로는 달랐다.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행했다.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하지 않았다. 외몽골의 독립과 대만(타이완)의 미수복을 제외하면 대청제국이 거의 계승되었다. '제국의 근대화'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고쳐 말하면 중층적 보편성을 상실하지 않았다. 제국성을 속 깊이 품고 있다.
건국 60주년을 지나 들어선 시진핑 체제가 '일대일로'를 국책으로 내세운 점이 우연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再活(재활)을 마치고 再起(재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中興(중흥)의 모색이다. 중국의 부상이 유라시아의 동반 성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가 공히 꿈틀거린다.
과연 포스트 몽골 시대는 여태 저물지 않았다. 커녕 포스트 서구 시대의 유력한 대안으로 점점 더 각광받게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의 서부, 왕년의 서역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20세기 '국가의 변경'이었던 장소들이 21세기 '제국의 관문'으로 뒤바뀌고 있다. 일대일로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있다.
중국이 '中國'이 될 것인가의 여부 또한 서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하기에 올해 하반기는 중국 서부에 가기로 한다. 그곳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西遊記(서유기)의 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라시아 견문] '인의예지'의 공화국
덕수궁, '덕수'의 참뜻을 아십니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한국에 다녀왔다. 한국냉전학회가 출범했다. 말석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학회일이 6월 25일이었다. 올해는 마침 해방/분단 70주년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2015년 '6.25'에 닻을 올리는 냉전학회가 '뜻 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 따져보니, '뜻밖'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다. 70년 전, 북과 남이 지금까지 해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상상을 불허하는 세월이 일흔 해나 쌓인 것이다. 문자 그대로, 積弊(적폐)이다. 적폐 중의 으뜸이다.
서울에 있는 동안 인사동에 머물렀다. 아침마다 북촌과 서촌을 산책하는 재미가 호젓했다.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출근길 시민들을 지켜보았다. 묘했다.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당장 이곳에 속해 있는 내부인도 아닌 처지이다. 생활의 보금자리를 나라 밖에 꾸린 지 5년째이다. 한국 또한 낯설게 보게 된다. 과연 이 나라를 견문한다면, 어떤 소재와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 결론은, 결국은, 분단이었다. 분단이야말로 한국과 북조선, 한반도를 이해하는 최종 심급이었다.
다만 분단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일정한 교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 간의 대결, 이념과 체제의 대결, 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은 피상적이다. 틀린 말은 아니되, 정곡을 찌르지 못한다. 70년의 시간만큼이나 관성적이고 타성적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다시금 요청된다.
나는 갈수록 분단의 심층으로서 전통과의 단절을 뼈아프게 새기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짐으로써 남과 북 공히 역사로부터 골절, 탈골되었다. 뿌리를 상실하고, 중심(=중도)을 잃어버렸다. 전통의 근대화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왕좌왕 맹목적인 근대화로 치달았다. 무릇 난세에는 극단이 승한다. 좌와 우가 끝내 분열하고 만 기저이기도 할 것이다. '극단의 세기'에 적응하는 방편을 두고 남과 북은 끝내 등을 졌다.
북은 强兵(강병)으로 치달았다. 남은 富國(부국)으로 내달렸다. 남과 북 공히 속도전을 벌이며 20세기형 근대 국가를 추구했다. 결국 북은 군사 국가, 武人(무인) 정권이 되었고, 남은 기업국가, 小人(소인) 천하가 되었다. 문인=군자를 제일로 쳤던 조선과는 아득한 새 나라가 제각기 들어서고 말았다. 조선 문명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두 국가가 조선의 적통을 자처하며 반목하고 갈등하는 풍경이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역설이다.
하기에 북과 남의 통일 또한 남과 북의 재회에 그치는 일만은 아니지 싶다. 부디 아니어야 할 것이다. 再活(재활) 운동이 절실하다. 전통과의 재접속, 전통의 혁신, 전통의 근대화가 긴요하다. 남과 북이 합류하고 협동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 각자의 적폐와 누습을 해소하고, 자기 부정과 자기 상실로 점철된 근대화의 상처 또한 치유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독립 국가 만들기에 좌우합작이 필요했다면, 21세기 통일 국가, 문명 국가 만들기에는 '고금(古今) 합작'이 긴절하다.
가지 못한 길
나는 거듭하여 1894년 동학 운동을 돌아본다. 청일 전쟁으로 천하가 무너지던 해, 조선의 開闢(개벽) 또한 좌초되었다. 결국 개조(북)와 개혁(남)으로 척을 지었다. 남북 분단의 심층 또한 신/구 간 분단에 바탕 할 것이다. 그럴수록 더더욱 東學(동학)을 되새기고 곱씹는다.
동학은 西學(서학)을 배타하지 않았다. 서학을 되감아 치는 회심이 발군이었다. 전통을 내다버리지도 않았다. 儒學(유학)의 민중화를 꾀했다. 사대부의 교양과 일상을 전 인민에게 널리 보급하는 동방형 민주화 기획이었다. 國學(국학)으로 함몰되지도 않았다. 신세계와 신세기로 열려 있었다. 고금 합작의 원조이고 원형이었던 것이다. 서학과 국학의 분단 체제를 허물고, 구학과 신학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동아시아학이 지향해야 할 덕목을 상당 부분 내장하고 있었다. 반추할수록 굉장하고 신통하다.
1894년의 좌절로 동학이 단절된 것만도 아니지 싶다. 망각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실할 것이다.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 유럽이 아닌 대륙행을 선택했던 이들의 행보와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타지와 타국에서 쓰고 남겼던 기록들이 한글과 한문을 아울러 산적하다. 다만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연구가 부족하고 부실하여, 정당한 평가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간의 판단 기준과 잣대가 원체 '근대'에 편향되어 있던 탓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산더미이다. 그 사각지대에 20세기가 허락하지 않았던 가지 못한 길, '조선의 근대화'가 어렴풋 자리한다.
그러나 시세가 변하고 있다. 시절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난세가 끝물에 접어들었다. '장기 20세기'가 황혼을 지나고 있다. '반전 시대'의 초입에 진입했다. 동과 서가 뒤집어진다. 미국과 중국의 역관계가 뒤집어진다. 해양과 대륙의 세력 균형도 뒤집어진다. 오해는 삼가자. 동방이 서양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 아니다. 동서의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과 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재균형'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돌출했던 유럽도 유라시아의 일원이 되어간다. 중국, 인도, 이슬람의 유라시아 3대 문명권에서도 집합적 네오 르네상스의 기운이 여릿하다.
한반도의 (재)통일 또한 이 네오 르네상스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 운동 또한 점점 더 문명사적 지평에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근대화'를 복기할 때이다. 100여 년 전, 기미독립선언서(1919년)만 해도 조선 문명의 주체성과 보편성을 계승하는 면모가 역력했다. 민족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태평천하)를 동시에 염려했다.
해방기 백범의 <나의 소원>은 조선 문명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그가 염원하던 문화의 힘이야말로 중화 문명, 인문 국가, 대동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의 근대화에 방불했다. 김구가 소싯적, 동학에 입문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탈조선화와 탈주체화의 선봉에 섰던 이승만과 김일성과는 根性(근성)이 다른 인물이었다. 기민한 혁명파보다는 우직한 재건파였다.
하여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를 21세기형 동학 운동을 재개하는 기간으로 삼을 만하다. 고려 말의 성리학이 새 조선의 기틀이 되었던 것처럼, 조선말 동학을 계승하고 보완해서 통일 국가의 헌장으로 삼아도 좋겠다. 해방(1945년)은 도둑처럼 왔으되, 통일(20??년)만은 만반으로 준비할 일이다. 30년 대계,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

나의 소원
2015년 6월, 서울은 온통 어지러웠다. 역병으로 야단법석, 아수라장이었다. 얄궂게도 역병을 덮은 것은 나라님의 몽니였다. 배신을 운운하며 심판을 하령했다. 낯이 뜨거운 살풍경이었다. 지도자부터가 좀체 어질지 못하다. 그 어질지 못한 여인을 지배자로 선택한 국민들 또한 몹시 어리석었다.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민중과 시민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근대적 편견은 서둘러 떨치는 편이 낫겠다. 비단 한국만도 아니다. 1987년 전후에 민주화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대만(타이완), 태국(타이), 필리핀을 아울러 살펴도 오십 보 백 보이다. 거버넌스가 엉망진창이다. 군자를 키워내는 小學(소학)과 大學(대학)에 소홀할 때,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소인들의 난장판'으로 전락한다. 해탈(=극기복례)을 방기한 해방의 정치가 공공 영역을 사사롭고 삿된 투석장으로 변질시킨다.
역시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다. 민주화 언 30년, 사람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었다. 소학은 소학(국민 교육)대로, 대학은 대학(엘리트 교육)대로 왜곡과 굴절이 극심하다. 그래서 민중은 민중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집합적 역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진 근본적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설픈 개인주의, 설익은 자유주의가 나라의 밑둥을 송두리째 허문다. 시민의 권리는 결코 천부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생 학습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貪瞋癡(탐진치)를 떨쳐내지 못한 범부들의 투표가 동시대는 물론 미래까지 갉아먹기 때문이다.
20세기 근대 문명의 파탄과 민주주의를 별개인 듯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깊이 결부되어 있다. 직시하고 직면해야 한다. 제발 태초부터 자유롭다는 '근대인' 흉내일 랑 그만 거두고, 오래된 경세와 경륜의 지혜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이다. 心學(심학)의 수양과 實學(실학)의 수련 없이 아무나, 함부로, 주권자가 될 수 없다. 모두가 군자가 되는 대동 사회, 만인이 보살이 되는 극락 세계야말로 동방형 민주 국가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역전 시대'가 아니라 '반전 시대' 또한 열릴 것이다.
징후는 이미 여럿이다. 중국은 유교를 재발견하고 있다. 인도는 요가를 세계화하고 있다. 이슬람은 율법으로서 자본주의를 교정하려 든다. 유라시아 곳곳에서 옛 물결이 새로 일고 있다. 한반도의 재통합 또한 이 새 물결을 거스르며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여태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 판을 짜는 새 거점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단지 구체제의 와해만이 또렷할 뿐이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불거진 '문학 권력' 사단을 보며, 이른바 '87년 체제'를 산출했거나 87년 체제의 산물이었던 진지들이 도처에서 붕괴하고 있음을 새삼 실감치 않을 수 없었다.
德壽宮(덕수궁) 돌담길을 오래 따라 걸었다. 덕수, 라는 뜻을 깊이 되새긴다. 마을마다, 유적마다, 한글에 가려진 한문 이름을 들추어 곰곰이 따져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 오래된 명명 속에는 여전히 옛 사람들이 꿈꾸었던 문명과 이상과 가치가 녹아들어 있다. 귀국하면 그 뜻을 받들어 새로이 잇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그래야만이 남북의 통일 또한 민족의 재통합이자 동방 문명의 갱신으로써, 지구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범인류적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내 한국은 견문으로만 그칠 수가 없었다. 어느덧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결국은 내가 돌아갈 현장이고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다. 애착이 남다르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에, 내 부모님이 살았고, 내 조상들이 먼저 살다 가신 이 땅 위에, 德(덕)이 오래도록 넘쳐흐르는 '仁義禮智(인의예지)의 공화국'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래서 후세와 후대에게도 아름다운 강산과 품격 있는 국가를 떳떳하게 물려주고 싶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국을 떠났다. 견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
[유라시아 견문] 'AIR ASIA' : 아시아의 하늘길
에어 아시아, '하늘길 민주화'의 상징
하늘 버스(Air Bus)
서울서 뵌 몇몇 분들이 경비 충당을 여쭈었다. 남북으로, 동서로, 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세세한 내역을 공개할 것은 없겠다. 다만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다닌다. 단연 저가 항공사 덕분이다. 기내식을 비롯해 부속 서비스를 줄임으로써 항공비의 거품을 거두었다. 착한 가격의 비행기들이 아시아를 촘촘하게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바지런하게 품을 팔아 온라인을 뒤지면 파격적인 액수의 월척을 낚을 수도 있다. '유라시아 견문'에 나설 수 있었던 만용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고 여긴다. 10년 전만 해도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가 항공사의 대표 주자로 '에어 아시아'를 꼽을 수 있다. 수년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아시아의 하늘(Air ASIA)이라는 이름부터 상징적이다. 거점은 말레이시아이다. 이 또한 우연만은 아니지 싶다. 경영진의 사업적 수완 못지않게 지리-문명적 소산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내륙부와 해양부를 잇는 가교적 위치에 자리한다. 아세안의 남과 북을 잇는 허리인 셈이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이다. 이슬람 세계와도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물론이요, 남아시아와 서아시아까지 연결망이 뻗어나갈 수 있었다. 왕년의 말라카가 해상(海上) 무역의 왕국이었다면, 오늘의 말레이시아는 천상(天上) 교통의 허브인 것이다. 에어 아시아가 쿠알라룸푸르와 직항으로 연결하는 아시아의 도시만 여든 곳을 넘는다.
그 뒤를 인도네시아가 바짝 쫓고 있다. 올해 파리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가장 큰 손으로 등극한 항공사가 인도네시아의 '가루다(Garuda)'였다. 보잉 787을 60대나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지갑을 활짝 열었다. 향후 10년간 250대의 비행기를 더 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수 천 개의 섬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국내 환경이 항공 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라마단이 지나고 맞이하는 최대의 명절 이둘 피트리(Idul Fitri)는 항공 업계의 최대 성수기이다.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 인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올해 에어 아시아는 이 기간에 맞추어 90대의 특별 여객기를 투입하여 1만6000명의 여행객을 더 소화했다.
인도네시아의 토착 저가 항공사 라이온 에어(Lion Air) 또한 50대를 추가 편성하여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표 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역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메카 순례에 나서는 무슬림 여행객들 또한 날로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국제선도 갈수록 분주해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아세안의 저가 항공사들은 8배 이상 성장했다. 2004년 2500만 승객을 소화한 것에 견주어 작년에는 2억 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기존의 항공사들이 1억8000만에서 2억6000만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앞으로 3년 안에 저가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대형 항공사들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세안의 통합과 저가 항공사의 성장이 공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말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면 이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6억 규모의 동남아 단일 시장이 등장한다. 인구로만 따지면 북미의 미국,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독일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공항마다 이미 아세안 창구가 따로 설치되어 '아세안 시민'들은 상호 무비자로 오간다. 육지와 바다를 경계로 나라와 나라를 가르던 장벽들이 현저히 낮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방콕, 싱가포르 등은 저가 항공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드나드는 허브 공항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자주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비행기 또한 국가와 국가를 잇는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도시와 도시를 네트워킹하는 미디어에 가까워진다.
말 그대로 하늘을 주행하는 버스(AIR BUS)처럼 보이는 것이다. 'Now, Everyone Can Fly'라는 에어 아시아의 모토야말로 '하늘길의 민주화' 선언이다.
하늘의 비단길
아세안의 번영은 아시아의 번영과 연동한다. 동남아는 중화 세계, 인도양 세계, 이슬람 세계의 교차로이기 때문이다. 파리 에어쇼 개최에 앞서 보잉사가 전망한 향후 항공 시장의 판도 또한 아시아와 중동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로 보잉사의 2010년대 주문 장부를 보노라면 아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타이), 말레이사아 등의 저가 항공사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이미 세계 10대 저가 항공사 가운데 다섯 자리를 아시아 회사들이 차지했다. 앞으로 20년간 아시아에서만 1만3000대의 민항기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34년이면 한 해 1만5000대의 비행기가 아시아 역내를 운행하며 도시와 도시들을 거미줄처럼 엮어갈 것이다. 비행기 생산보다는 19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조종사들의 수급을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한국만도 제주항공의 약진이 눈에 띈다. 김포와 김해를 제주와 이음으로써 960%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구가했다. 나아서 인천-홍콩, 부산-홍콩, 인천-나고야/오사카/도쿄로 이어지는 국제선도 선보였다. 양대 항공사를 잇는 업계 3위의 입지를 굳힌 것이다.
그러자 대한항공도 진에어를 출범시켰다. 저가 항공으로 인천을 제주, 홍콩, 마카오, 방콕, 치앙마이, 세부, 비엔티안(라오스), 오키나와, 삿포로, 나가사키 등과 연결한다. 특히 진에어가 선보인 서울-괌 5시간 구간은 중소형 비행기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되었다. 향후 중국 서부와 북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물적-인적 연결망이 더욱 긴밀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저가 항공사 또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중국도 뒤질 리가 없다. 대륙의 여행객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다. 지구촌 어디를 가도 유커(旅客)를 만날 수 있다. 중국은 지금도 82개의 신(新)공항을 건설 중이며, 앞으로 예정된 것만해도 100개가 넘는다. 연평균 7%의 승객 증가율을 감안하면, 10년 안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시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간에는 주로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국영 항공사가 항공 업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미 항공사 출범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했다. 저가 항공사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이용료를 인하하고, 오래된 공항들을 저가 항공사 전담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가령 상하이의 춘추항공(春秋航空)은 상하이-홍콩 간 편도 항공권을 10만 원대에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티베트항공은 '불교 여행'을 특화시킨 상품으로 인도와 동남아 노선을 야심차게 개척 중이다. 내년(2016년)이면 중국에서도 저가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아시아서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인도인들도 국내 여행마저 기차보다는 저가 항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올해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기차 대신에 비행기를 선택한 것이다. 가격차는 크지 않은데 비하여, 시간은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또한 2034년까지 연평균 7% 대로 비행기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300여대의 비행기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저가 항공사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새 천년의 하늘길은 전혀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고 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래 지난 세기의 항공로는 주로 대양을 건너 대륙을 잇는 것이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로,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을 지나 북미로, 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수많은 아시아계 디아스포라들이 양산되었다.
이제는 딴 판이고 새 판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는 대신에 아시아 대륙 역내를 순환하고 순회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남-북 간 이동에서 남-남 간 이동으로의 전환이다. 대양을 횡단하던 원거리-장거리 노선을 대신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단거리-근거리 노선이 촘촘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비행기의 꼴도 변해간다. 대양을 갈랐던 대형 항공기보다는 중소형 항공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먼 거리를 드물게 이동하기보다는, 짧은 거리를 더 자주 이동한다고 하겠다.
이 또한 1990년대 이래 '세계화'의 역설이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향했던 지난 세기의 일방통행이 동-서 간 남-북 간 쌍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방로가 순환로가 되어간다. 하늘길도 탈균형에서 재균형으로 반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태평양과 아시아로의 이주 노선이 판이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사업과 여행, 유학과 결혼 등 다방면에서 역내 인구의 환류(還流)가 여실하다. 이제 아시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인 교민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념과 체제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가까운 이웃과 척을 지던 시대가 저문 것이다. 20세기형 '동지애'보다는 왕년의 '이웃애'야말로 21세기에 더욱 어울리는 친밀성이라고 하겠다.
하여 새 천년의 실크로드 또한 육로와 해로의 복원과 재건에만 있지 않다. 하늘에도 새로운 실크로드가 비단처럼 깔리고 있다. 지금 나는 이 천상의 비단길을 따라서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한 차례 경유하는 번거러움은 있으되,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한 베트남의 저가항공사 비엣 젯(Viet Jet)을 이용하고 있다. 두 시간 후면, 프놈펜에 도착한다. 아시아는, 유라시아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유라시아 견문] SCO : 천하의 지정학
이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취한다!
이란 : Look East
캄보디아 견문에 앞서 이란부터 짚는다. 원체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핵 협상이 타결되었다. 녹록치는 않았다. 예정되었던 6월을 넘겨 지루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몇 차례 합의 무산의 위기도 넘겼다. 앞으로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짧게는 12년 서방의 경제 봉쇄가 일단락되었고, 길게는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새 천년 '그레이트 게임'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이 각별하다. 유라시아 대통합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이란의 '정상 국가화'야말로 유라시아 대동단결의 화룡점정이다. 새로운 세계 체제에 한발 짝 더 다가섰다.
서방의 경제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은 점진적으로 중동의 대국이라는 위상을 회복해 갈 것이다. 벌써 8000만 내수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럿이다.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교역으로 이란 붐이 예상된다. 특히 이란의 지리-문명적 위치가 백미이다. 유라시아의 한 복판에 자리한다.
이미 다양한 유라시아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브릭스(BRICs) 개발 은행, SCO(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 인프라 은행 등 가지가지다. 핵심은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관심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교류와 통합의 완성이다.
이 신유라시아 프로젝트에서 이란은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길(교통망, 통신망, 에너지 망 등)이 이란을 지나고 통과하기 때문이다. 20세기형 분리-통치에서 21세기형 통합-공치(共治)로 가는 길목에 이란이 자리한다. 전략적 요충지가 아닐 수 없다.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이 곧 이란과 서방의 관계가 한층 밀접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란은 더 더욱 동방과 긴밀해질 것이다. 인도의 'LOOK EAST' 정책이 이란으로 옮겨가는 꼴이다. 빈에서 핵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기어코 짬을 내어서 러시아의 우파(Ufa)에 다녀왔음을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파에서는 브릭스 정상 회의와 SC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란은 브릭스의 일원도 아니고, SCO 또한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파에 친히 찾아감으로써 향후 이란 외교의 축이 '동방 정책(Pivot to Asia)'에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돌아온 것이다.
당장은 파키스탄과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슬라바마드(파키스탄 수도)는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또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오래 기다려왔다. 중국과의 경제 회랑을 이란까지 연결하는 '一帶(일대)'와 '一路(일로)'의 가교 역할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파키스탄은 과다르 항을 이란의 국경까지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거리는 불과 80킬로미터 남짓이다. 과다르 항이 왕년의 중화제국과 페르시아제국을 잇는 유라시아의 '신경 중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럴수록 파키스탄 또한 이란과 중국,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국가(Gateway State)가 되어간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 반서구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반서구 자체가 서구에 결박되어 있는 20세기형 탈식민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노정한다. 그래서 점차 서구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란이 반갑기 그지없다. 반서구적/반근대적 이슬람에서 '이슬람적 근대화'로의 반전을 기대케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이란은 점점 더 유라시아의 일원이 되어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공산주의/사회주의)도 서(자본주의/자유주의)도 대안이 아니라던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의 예지에 더욱 가까워진다. 역사의 역설이고, 奸智(간지)이다.
이슬람 세계는 내년(2016년)에 견문할 계획이다. 짐작컨대 이란의 지리-문명적 잠재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이면 SCO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천년 이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욱 소상하게 짚을 것을 기약한다. 이번에는 SCO부터 정리해두기로 한다.
진화하는 SCO
올해 SCO 정상 회의에서는 획기적인 결정이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동시 가입을 승인한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또한 남아시아의 '분단 국가'이다. 1947년 대영제국에서 독립하면서 두 국가로 갈라섰다. 간디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반목으로 끝내 등을 진 것이다. 이후에도 줄곧 앙숙이었다. 헌데 SCO는 양국이 화해 과정에 진입해야 동시 가입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양국이 옵서버 자격의 준회원이 된 것이 2005년이었으니, 10년 만의 결실이다.
변화의 계기는 인도였다. 지난해 모디 정권이 출범했다. 힌두 민족주의자로서 모디는 인도 문명의 재건을 표방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동방 문명의 중흥이라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도 밀접하게 다가서고 있다. 올해 5월 중국 국빈 방문이 상징적이다. 대당제국의 수도인 시안부터 방문하여 시진핑과 손을 잡는 기지와 총기를 선보였다. SCO의 정식 회원 승격도 작년 9월에 일찌감치 신청해 두었다.
SCO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교해볼 수 있겠다. 나토는 가맹국 중 일국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가 반격을 가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냉전형 동맹을 제도화하여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집단 안보 기구라고 하겠다. 반면 SCO는 합동 군사 훈련을 전개하되, 회원국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유연한 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목 단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내 보기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유라시아의 통합을 이끌어가는 국제 기구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SCO의 전신은 '상하이 파이브(5)'였다. 1996년 설립되었다. 중국 서부 개발의 연장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출범 취지였다. 실질적인 과제는 중앙아시아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이에 이슬람 급진 세력의 왕래를 방지하는 '테러 대책'에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북방에서 비롯되었다. 푸틴이 등장(2000년)했다. 2001년 러시아가 가입함으로써 상하이협력기구로 개명한 것이다. 이때부터 중-러가 협조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미국의 일극 체제를 허무는 과업을 추진해가기 시작했다. 양국이 누리고 있는 군사적 독립, '자주 국방'이 독자 행보의 밑천이었다.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전공으로 삼아온 역사학자로서는 SCO의 구성 방식이 특히 흥미롭다. 정식 가맹국 외에, 옵서버, 대화 파트너 등으로 준회원의 위계를 두고 있다. SCO 밖에 있는 나라들을 배제하고 적대하기보다는, 차등적 방식을 통하여 더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점점 더 폭넓게 포섭해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 20세기형 동맹과는 일선을 긋는다. 오히려 왕년의 중화제국을 연상시킨다. 자국과의 친밀한 정도의 여부를 따져서 국가들을 분화하고 상이하게 대응했던 외교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학문적 용어를 빌자면 '차서(差序)'적 발상에 가깝다. 차서란 다른 문화를 포용해가는 중화 세계 특유의 기제를 일컫는다. 중원-번부-조공-호시-조약의 중층적 질서를 통하여 다양한 문명권을 아울러 갔던 것처럼, SCO 또한 '차서의 근대화'를 통하여 유라시아를 한층 크고 넓게 품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돌아보면 2005년 옵서버 자격을 부여한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그치지 않았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도 있었다. 미국이 한창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란까지도 장기적으로 포용해가는 전략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차서적 발상의 근대화를 곧 조공-책봉 체제의 부활로 곡해할 것은 없겠다.
오히려 중화 세계가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던 태평성대의 저비용 고효율 방책으로서 곰곰이, 또 꼼꼼히 되새겨볼 일이다. 혹여 SCO가 차서적 원리를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 제도적으로 쇄신하고 갱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편이 나라의 장래에도 득이 된다. 남북 분단을 해소해가는 뜻밖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소련의 속국에서 벗어난 (외)몽골이 SCO에 옵서버로 참가한 것은 2004년이었다. 유럽연합 가입에 안달하던 터키가 SCO로 선회하여 대화 파트너가 된 것은 2012년이었다. 그리고 올해 우파 회의에서는 벨라루스가 새 옵서버로 참가했으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은 처음으로 대화 파트너가 되었다.
나아가 '아랍의 봄' 이후를 모색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맹주 이집트까지도 SCO의 대화 파트너가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로써 SCO는 갈수록 유라시아 대륙 전역의 국가들을 각기 다른 형태로 수용해가는 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태 별다른 호응이 없는 국가로는 조지아(그루지야)와 방글라데시, 부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조지아는 최근에도 나토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을 만큼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현대화된 속국'이다. 방글라데시와 부탄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아시아의 국가들이다. 아무래도 인도의 입김이 미친다. 인도가 SCO의 정식 회원이 된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올해 SCO 정상 회의는 시리아 내전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세기 영국과 미국이 분탕질을 쳤던 이래 혼란과 혼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중동 문제까지 SCO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조짐이다. 역사의 추세와 대국을 보노라면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마저도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SCO와 등을 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여 '유라시아 견문'을 일단락 지을 2018년이면 SCO는 대략 유라시아의 7할, 35억 인구를 아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군사 안보 기구에 그치지 않고, 범 유라시아의 '대동 세계', '조화 세계'를 선도해가는 문명 간 통합 기구로 진화하는 것이다.

▲ SCO(상하이협력기구). 옵서버 국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시에 회원국이 되면서 그 영역이 더욱더 넓어졌다.
천하의 지정학
지난 200년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과 미국은 국가들과 세력들 간의 대립을 부추겨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이란/이라크/사우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수니파/시아파,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등 도처에서 나누고 쪼개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한반도의 분단 또한 그 일환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고 재생산하는 핵심 기제였다. 이러한 패권 전략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 소위 '지정학(Geo-Politics)'이다. 그리고 이 지정학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유명한 비유처럼, 유라시아를 분할하고 분단하는 것을 핵심 교리로 삼는다. 해양 제국 영국과 그 후계 패권국 미국(및 영미의 대리인 일본)이 대륙을 포위하고 지배하기 위한 학문의 이름을 빈 책략이었다.
그 지정학에 빗대어 보더라도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주도하지 싶다. 영미 패권 아래서 의도적으로 저지되거나 방치되었던 유라시아 연결망이 신 실크로드라는 이름 아래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래는 여럿이다. 초원길, 바다길, 하늘길 등 육해공은 물론이요 온라인/디지털 연결망까지 겹겹이다. 100년만의 지정학적 대반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동시 가입을 견인해낸 것처럼 SCO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경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영미의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모으고, 잇고, 엮고, 통합하고 융합한다.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열 또한 SCO의 틀 아래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공산이 크다. SCO가 유라시아 전체를 아울러 평화와 안정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큼지막한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흡사 왕년의 '天下(천하)'에 방불하다. 옛 사람들은 국가 또한 私(사)에 그친다고 여겼다. 20세기처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 서세동점에 직면한 계몽기 지식인들은 '민족의식'과 '국가 의식'이 없음을 개탄했다. 민족주의를 고취한다며 고대사까지 창작하기 일쑤였다. 실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단련했던 것이다.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는 공공 의식으로 무장해 있었던 것이다. 내 나라만을 위해서는 내 나라의 태평 또한 이루기 어려움을 터득하고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천하만이 公(공)이라며 누누이 가르치고 다그쳤던 것이다. 만시지탄이로되 天下爲公(천하위공)을 교시로 삼았던, 천하의 지정학을 공부할 때가 되었다. 너무 늦지는 말아야 하겠다.
[유라시아 견문] 캄보디아 : 속국의 민주화
킬링필드의 진실, 그 때 미군 폭격이 있었다
킬링필드 산업
캄보디아는 근 10년 만이었다.
2004년 초, 배낭여행으로 갔었다. 단편적 기억만 있다. 아침으로 바게트 빵을 먹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신기했고, 시엠립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처음으로 북조선 사람들을 접했다. 앙코르와트에서는 <화양연화>를 흉내 내며 첫사랑을 마감하는 허세를 부렸고, 프놈펜에서는 킬링필드의 비극을 애감해하는 상투적인 포즈를 취했다. 한참 빠져있던 미니홈피에는 당시의 풋내 나는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어렸고, 어설펐다.
그 사이 나는 사회학도에서 역사학자가 되었고, 서방의 이론(theory)을 섬기기보다는 동방의 사론(史論)을 세우는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 여행 또한 자의식이 분출하는 감상에 젖기보다는 시무(時務)책을 건의했던 연행록에서 영감을 얻는 편이다. 관광보다는 견문의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한다.
하기에 두 번째 캄보디아 행에서는 유적지에 통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관광객이나 여행 산업 자체가 더 흥미로웠다. 프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도 단연 여행객들이 많았다. 여전히 아세안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의 일국이라고 해야 어울릴법한 가난한 나라이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은 드물었다.
10년 사이 메콩강변에 자리한 카페와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고니찌와' 대신에 '니하오'로 인사한다. 실제로 프놈펜 시내는 '일국삼어(一國三語)'라도 되는 냥, 영어만큼이나 한자 간판이 많았다. 특히 금은방과 노래방, 쇼핑몰과 레스토랑에는 어김없이 한자가 병기되어 있었다. 이곳도 화교가 바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에도 그러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한자에는 도무지 까막눈이었던 시절이다. 아침 식사를 하며 영자 신문과 화교 신문을 번갈아 읽을 수 있게 것도 지난 10년의 변화이다. <프놈펜 포스트> 1면에서는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을 확인하고, <남화(南華)일보> 경제면에서는 방콕-프놈펜 간 고속도로 건설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비단 개인적 변화라고만 여기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의 소산일 것이다. 1990년대 이래 세계화가 '단기적 미국화'를 지나 '장기적 중국화'에 들어섰다.
캄보디아 여행은 크게 둘로 나뉜다. 시엠립에서는 앙코르 제국의 위대함에 감탄한다. 프놈펜에서는 킬링필드의 비극에 전율한다. 대부분의 관광 상품이 그렇게 짜여 있다. 10년 전 나도 그러했다. 소수의 배낭족만이 시하눅빌의 해변까지 즐기다 돌아간다.
캄보디아에 대한 서적도 비슷하다. 프놈펜 시내에도 'Monument Books'가 있었다. 동남아 곳곳에 자리한 영어(및 프랑스어) 전문 서점이다. 이제는 나에게도 친숙한 곳이 되었다. 가는 도시마다 이 서점을 찾곤 한다. 프놈펜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멀지 않고, 세계은행 사무실과 지척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도서들도 앙코르와트와 크메르루주로 대별할 수 있었다.
마침 올해는 크메르 루주 정권이 들어선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1975년 4월 17일이었다. 올해는 또 베트남 통일 40주년이도 했다. 4월 30일이었다. 4월 17일에 프놈펜이 점령되었고, 4월 30일에 사이공이 함락되었다. 남베트남에 앞서 캄보디아부터 적화된 것이다.
두 사건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아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폴 포트는 사력을 다해 프놈펜으로 진격했다.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시키기 전에 프놈펜을 접수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초조했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이후에는 캄보디아까지 침공할 것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킬링필드의 전조였다.
1970년대 전체를 아울러 조망할 필요도 있다. 1975년 킬링필드의 비극은 1970년과 1979년 사이에 일어났다. 1970년 10월 9일에는 론 놀의 쿠데타가 있었다.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군사 정변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며 중립 노선을 고수했던 시하누크 국왕은 축출되었다.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망명객 신세가 되었다.
미국은 론놀을 내세워 베트남 전쟁을 대리 수행했다. 남베트남에 진주하고 있던 미군들도 캄보디아로 진격했다. 국경 지대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한다는 명분이었다. 악명 높은 폭격도 시작되었다. 1975년까지 약 270만 톤의 폭탄이 캄보디아에 투하되었다. 물론 적들만 골라 정밀 타격할 수는 없었다. 민간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폭격이었다.
론 놀의 본심은 달리 있었다. 그는 반공주의자보다는 반베트남주의자였다. 미국의 지원 아래 (북)베트남에 대한 성전을 벌인다고 자위했다. 당시 선전 포스터에도 붉은 별의 모자를 쓴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이 캄보디아의 승려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즉, 론 놀과 폴 포트는 좌/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캄보디아의 '주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프랑스는 100년 손님이고, 미국은 5년 손님이었지만, 베트남은 '1000년의 외세'였기 때문이다. 사이공을 비롯한 남베트남의 거개가 한때는 캄보디아의 영토였다.
킬링필드가 대학살이고 대참사였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곳만큼은 두 번째 방문에서도 숙연하고 처연했다. 도시는 소각되었고, 화폐는 폐지되었으며,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다. 교사의 80%, 의사의 95%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다만 이 극단적 히스테리에는 하노이에서 외국물을 먹고 온 '친베트남파'에 대한 강박적 두려움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남진(南進)을 거드는 내부의 적이라고 여긴 것이다.
게다가 킬링필드의 피해 또한 과장이 심하다. 불과 3년 남짓에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되었다는 억측이 만연하다. 인구의 4분의 1이 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1970년대 전체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한 인원부터,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까지 도합한 숫자이다. 과연 5년의 무차별 폭격과 3년의 집단 학살 가운데, 어느 쪽의 인적 피해가 더 컸는지 단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기록의 편중과 기억의 편향이 막심하다. 폴 포트의 '적색 킬링필드'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의 전쟁 범죄, '백색 킬링필드'는 철저하게 가려졌다. 1970년대의 인도차이나라는 시공간적 맥락은 생략된 채, 아시아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함과 야만성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꼴이다.
그럼으로써 탈냉전기 세련된 형태의 반공주의에 복무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인권 외교'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집단학살심판법안(The Cambodia genocide justice act)을 입안했다, 국무부 산하에 전담 기구를 두고 80만 달러의 예산도 투입했다. 특히 예일대학교의 제노사이드 연구소에 용역이 집중되었다. 크메르루주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킬링필드 연구'의 본산이 되었다.
20년이 흐른 지금, 이 예일산 연구 성과들이 킬링필드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온 여행객들이 페이스북와 트위터 등을 통하여 킬링필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확인하고 재확산시킨다. 어느새 킬링필드 또한 홀로코스트처럼 일종의 '기억 산업'이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작 1979년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감감하다. 크메르 루주 정권이 전복된 것은 1979년 1월이었다. 폴 포트의 불길한 예감은 예지로써 적중했다. 끝내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점령하여 10년이 넘도록 지배했다. 폴 포트는 1980년대 내내 태국(타이) 국경에 근거지를 두고 '천년 외세'에 맞선 항전을 지속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밀림 속의 폴 포트를 기억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킬링필드 3년으로만 기억될 뿐이다. 역시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폴 포트를 밀어내고 캄보디아의 지배자로 등극한 이가 30년 독재자 훈센이다.


훈센 : 속국의 독재자
베트남의 캄보디아 공격은 1978년 12월 25일 시작되었다. 10만 명의 최정예 베트남군이 성탄절에 맞추어 출격했다. 캄보디아를 접수하는 데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실전으로 단련된 막강한 부대였다. 프랑스와 미국을 연이어 물리친 세계 유일의 군대였다. 베트남은 1979년 1월 7일 프놈펜 '해방'을 선언했다. 크메르 루주의 악몽이 끝났다고 선포했다. 민주 캄푸치아는 전복되었고,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
즉각 베트남을 모델로 삼은 국가 개조가 단행되었다. 10만 명의 베트남군이 상시 주둔했다. 총책임자는 베트남의 혁명 원로 레득토(Le Duc Tho)였다. 학교야말로 새 나라의 초석이었다. 교실마다 스탈린과 호치민의 사진이 걸렸다.
사회주의 학습도 교정되었다. 폴 포토의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소련과 베트남의 정통 사회주의를 가르쳤다.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의식'이 주입되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소련의 속국, (외)몽골이다. 유목민을 노동자로 개조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신생 캄보디아 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해외 사절단이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몽골 대표단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을 영접한 캄보디아의 외교부 장관이다. 당시 불과 27세, 새파랗게 어린 세계 최연소 장관이었다. 훈센이다.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29세에 부총리가 된다. 그리고 1985년 1월 14일, 33세의 나이로 총리 자리에 오른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랜 집권자 중의 하나가 된다. 2015년 올해까지 장장 30년, 인생의 절반을 국가수반으로 살았다.
그가 크메르 루주의 탄압을 피해 베트남으로 피신한 것은 1977년이었다. 베트남에 충성 서약을 하며 하이푹(Hai Phuc)이라는 베트남식 이름도 얻었다. 이듬해에는 캄푸치아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본뜬 캄보디아 판 혁명 조직이었다. 그리고 1979년 베트남군의 프놈펜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 베트남의 비호 아래 1981년 캄푸치아 인민혁명당을 발족시켰고, 1985년 캄보디아 인민당으로 개명했다. 30년 통치를 함께한 영구 집권당이었다.
훈센이 총리로 등극한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해였다.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자,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를 선언하며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시장의 합리성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캄보디아 점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련의 원조에 기생하던 점령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소련군이 동유럽에서 철군하던 1989년, 베트남군도 캄보디아에서 철수했다. 동유럽과 동남아의 탈냉전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10년의 점령 비용은 값비싼 것이었다. 2만3000명의 베트남군이 목숨을 잃었다. 저강도의 킬링필드였다.
그럼에도 베트남이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점령 기간 광범위하고도 정교한 지배망을 구축했다. 지금도 수백 명의 베트남 전문가들이 국제협력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크메르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국적을 세탁하여 캄보디아의 고위 관료로 남아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복심, 훈센이 건재하다. 애초 훈센을 총리로 발탁한 이도 레득토였다. 훈센에게 세계 정세를 가르친 것은 캄보디아 대사 응오디엔(Ngo Dien)이었다. 레득토의 총애와 응오디엔의 지도 아래서 훈센의 정치적 성장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보은으로 훈센은 1985년 국경 협상에서 베트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체결해주었다. 현재 베트남의 최남단 영토인 푸꾸억(Phu Cuoc)을 넘겨준 것이다.
2015년 7월 15일자 <프놈펜 포스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던 바로 그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기원이다. 30년 묵은 적폐이다.
1989년 베트남이 떠나면서 캄보디아의 국명은 다시 변경되었다. 인민공화국을 지우고 캄보디아국이라 했다. 입헌군주제로 돌아갔다. 시하누크도 김일성 주석이 선물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프놈펜으로 복귀했다. 실권은 없을망정 '상징 국왕'의 허울은 되찾은 것이다. 국기와 국가도 새로 정했다. 소승 불교도 재차 국교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점령 유산은 여전했다. 당장 1월 7일부터 크게 기린다. 올해는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공동으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였다. 때문에 크메르 양식의 독립기념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베트남풍의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탑을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한 것이었다. 몇몇 캄보디아 지식인을 만나 속내를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킬링필드의 산업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쪽은 크게 셋이다. 우선은 베트남이다. 캄보디아 점령을 합리화할 수 있다. 둘째는 훈센이다. 캄보디아를 학살과 폭정에서 구해내었다는 것이 30년 집권의 명분이다. 끝으로는 미국이다. 크메르 루주의 비극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거듭 추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미국의 기묘한 공모 속에 훈센의 장기 독재가 터하고 있는 것이다.

▲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탑.
속국의 민주화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캄보디아를 접수한 것은 유엔(UN)이었다. 1991년부터 1만6000명의 평화유지군과 5000명의 민간고문단이 파견되었다. 이번에는 사회주의를 대신하여 민주주의가 이식되었다. 캄보디아 재건을 위하여 2년간 유엔이 쏟아 부은 돈은 30억 달러였다. 유엔인권헌장에 바탕 한 모범적 헌법을 만들어 주었고, 선거와 다당제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도 닦아주었다. 사실상 유엔의 보호국이었던 것이다.
성과는 대단한 듯 보였다. 첫 선거의 투표율이 90%에 육박했다. 유엔은 환호했다. 동남아의 가난한 소국마저 민주주의를 오래 갈망해 왔다며 제 논에 물을 댔다. 한창 도취되어 있던 무렵이기는 했다. 소련이 제풀에 무너졌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신세계 질서'를 제창하고, 민간의 어용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던 무렵이다. '프라하의 봄'에 빗대어 '프놈펜의 봄'을 운운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는 동유럽이 아니었다. 캄보디아는 폴란드도 남아공도 아니었다. 하벨이나 바웬사, 만델라가 없었다. 김대중도 없었고, 아웅산 수치도 없었다. 헌법은 허공을 맴돌았다. 신정부 수립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간 유엔을 대신하여 지상을 장악한 것은 여전히 훈센과 캄보디아 인민당이었다.
베트남이 이식한 일당 국가 체제 아래서 국가 권력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침투했다. 그 조직 사업을 담당하던 이가 훈센이었다. 그래서 유엔이 하사한 민주주의 아래서도 능란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민중들을 대상으로 때로는 뇌물로 때로는 협박으로 표를 긁어모았다.
캄보디아에서 선거란 훈센의 권력을 거듭 확인하는 '정치 극장'에 불과했다. 물론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과 사법 기관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한 편법이 판을 쳤고, 야당에 대한 탄압도 무지막지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 '사담 훈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에는 이라크처럼 석유가 나지 않기에 자신의 운명은 후세인과는 다를 것이라며 미국의 위선을 조롱했다. 서구의 '민주주의 교조주의'를 마음껏 비웃으며 세계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거푸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훈센이 야당을 향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가 킬링필드에 대한 악몽이다. 인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재차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공포심을 조장한다. 또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겁박한다.
기실 프놈펜 시민들도 유엔의 진주를 환영했었다. 허나 인권이니 민주주의 때문은 아니었다. 달러에 환장했다. 2년간 캄보디아에 풀린 30억 달러는, 유엔 관련 인원들이 하루에 145달러씩 썼다는 말이 된다. 이는 당시 캄보디아인들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달러 경제로 흥청망청하면서, 사회주의 시절과는 화끈하게 안녕을 고했던 것이다.
지금도 프놈펜에서는 자국 화폐인 리엘 대신에 달러가 더 널리 통용된다. 레닌대로 옆 러시안 마켓에서도 달러를 선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ATM에서도 달러가 인출되어 당혹스러웠다. 화폐 주권일랑 좀체 괘념치 않는 모양이다. 즉, 훈센 통치 30년간 캄보디아는 이중적 속국이 되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베트남에, 경제적으로는 해외 원조에 종속되어 있다.
하여 야당의 구호 또한 '독재 타도'나 '민주 수호'가 아니다. 반훈센은 곧 반베트남으로 이어진다. 2013년 대선이 상징적이다. 야당이 반베트남으로 대동단결하여 단일대오를 형성함으로써 훈센과 박빙의 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풍문도 들린다.
돌아보면 독립 이후 줄곧 그러했다. 캄보디아의 정치적 균열의 핵심에는 늘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었다. 크메르 루주는 반베트남 좌파였으며, 론 놀은 반베트남 우파였다. 시하누크 국왕은 반베트남 중립파였다. 그럼에도 결국 친베트남 좌파였던 훈센이 권력을 차지했던 것이다. 그만큼 베트남의 영향력이 드셌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아울러 20세기 베트남은 대약진했다.
2013년 선거에서 반베트남 단일 전선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세대 변수가 결정적이었다. 역대 가장 젊은 선거였다. 유권자 950만 가운데 30대 이하가 350만이었다. 처음으로 투표하는 이도 150만을 헤아렸다. 1979년 이후 태어난 이들이 인구의 다수를 점해가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크메르 루주'의 직접적 기억이 없는 세대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킬링필드의 학살과 폭정에서 캄보디아를 구해냈다는 훈센의 해방서사가 먹혀들지 않는다. 오히려 캄보디아 신세대들이 경험한 베트남은 자국의 독재자를 막후에서 지원하는 후견국이자 패권국이다.
그래서 제1야당의 이름 또한 '구국당'이다. '속국의 민주화'에서 '독립국의 민주화'로의 이행이 캄보디아의 시대정신이 된 것이다. 다음 대선은 2018년이다. 2013년보다 더 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못다 이룬 '2013년 체제'의 가능성이 한층 높다. '2018년 체제'의 도래를 기원하며, 캄보디아의 또래들을 응원한다.
그럼에도 캄보디아의 제2차 민주화가 크메르 루주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베트남과 담을 쌓고 벽을 치는 '주체 노선'만으로는 나라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오히려 동남아의 동서남북을 잇고 엮었던 앙코르제국의 유산을 생산적으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마침 앙코르 제국의 연결망을 복원해내는 '앙코르 로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남화일보>에서 읽었던 프놈펜-방콕 고속도로와도 연동되는 흥미로운 고고학 복원 사업이다. 다음 글에서 살피기로 한다.
[유라시아 견문] 이슬람 경제 : 진화하는 '아시아적 가치'
"돈 빌려주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1997 : 복습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길은 버스를 이용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떨어져나가기 전까지 한 몸이었던 나라이다.
과연 입출국 절차는 간단했다. 출국 수속을 공항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밟았다는 점이 특이한 경험이었다. 지금은 쿠알라룸푸르까지 직행하면 다섯 시간 남짓 걸린다. 착공 중인 고속철이 완공되면 한 시간 대로 줄어든다. 탈식민의 여로에서 갈라섰던 두 나라가 재차 긴밀히 엮이고 있는 것이다. 분리 독립에서 대통합으로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견문이 늘 계획처럼 되지는 않는 법이다. 예기치 않게 싱가포르 일정이 다소 늘어났다. 탓에 말레이시아 일정은 단축되었다. 왕년의 해상 무역 도시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말라카는 보는 둥 마는 둥이었다. 고즈넉한 옛 도시에서 지긋하게 역사를 음미해보고자 했던 애초의 기대는 접어야 했다.
곧장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행의 목적은 뚜렷했다.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슬람 경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과 할랄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조바심은 기우였다. 쿠알라룸푸르 버스 역에 내리자마자 이슬람 금융 상품을 선전하는 간판들이 여럿 보였다. 숙소를 향해 걷는 20여 분 동안에도 이슬람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와 이슬람 보험 상품의 광고를 수시로 접할 수 있었다. 이슬람 경제는 이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듯 보였다.
말라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새내기 시절을 한참 회상했다. 1998년 최초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대학생이 되었다.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사태)로 나라가 한참 혼란스럽던 시절이었다. 원인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다. 베스트셀러도 확연히 갈렸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 펴냄)가 '내 탓'에 치중했다면, <세계화의 덫>(영림카디널 펴냄)은 '남 탓'을 하는 쪽이었다. 덩달아 '아시아적 가치' 논쟁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나는 오락가락이었다. 개발 독재를 엄호하는 유교 자본주의론이 탐탁지 않으면서도, 신자유주의로의 재편 또한 내키기가 않았다.
돌아보니 커다란 착시가 있었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에 맞서 '아시아적 가치'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친 주역은 마하티르 모하마드였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수상이었다. 이슬람 국가의 총리였던 것이다. '유교'로 퉁 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싱가포르가 정치적 영역에서 서구형 민주와 일선을 긋는 독자적인 통치 모델을 실현했다면,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지 않으며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차이를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 솔직히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의 나의 사고 지평이란 서구의 이론과 한국의 현실 사이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동남아는커녕 동북아도 잘 몰랐다. 응당 이슬람 세계는 더더욱 멀었다. 그래서 17년이 더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1997년 당시 말레이시아의 담론 지형을 복기하고 복습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 말라카
1997년 중엽부터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의 가치가 급락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마하티르는 즉각 국제 투기 자본을 지목했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해외 투기꾼들의 탐욕과 무책임의 소산이며,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국제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래서 고정 환율제와 자본 통제로 맞대응했다. IMF의 처방과는 정반대로 응수한 것이다. 그리고 조기에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평판은 크게 갈라졌다. 서구에서는 이단자로 취급했다. 말레이시아서는 경제 주권을 지킨 민족주의자로 받들었다. 양쪽 모두 일면적이고 편파적이었다. 마하티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가 발표했던 '비전 2020'은 말레이시아를 선진 산업 국가로 변모시킴으로써 가장 현대적인 무슬림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었다. 즉 민족주의도 반서구주의도 반쪽자리 독법이다. '비서구적 세계화'를 추진했다고 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일국적 발전주의에 그치지도 않았다. 이슬람과 세계화를 결합시킴으로써 무슬림 세계의 첨단이 되기를 도모했다.
그런데 마하티르와는 또 다른 지점에서 당시의 금융 위기를 진단하는 세력도 있었다. 제 1야당, 파스이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정치 세력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여당이 암노(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였고, 야당이 파스(PAS·Parti Islam Se-Malaysia)였다.
암노는 말레이 중산층에 화인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파스는 이슬람에 기초한 정당이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이슬람 가였기에 암노 역시 이슬람을 적극 동원했다. 다만 근대화와 세계화를 성취하기 위한 훈육 기제로서 이슬람을 활용한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암노가 말하는 이슬람이란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일구었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거의 판박이였다. 마하티르가 주창했던 '신 말레이인'이 바로 자본주의에 적응한 이슬람의 상징이었다.
반면 파스는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근대화와 세계화를 교정하려는 세력이었다. 여와 야가 보수/진보, 좌/우로 나뉜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근대화에 대한 태도로 갈라진 것이다. '어떤 이슬람인가'가 관건이었다. 파스의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독법은 한층 과격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 앙숙 관계의 연속으로 간주했다. 십자군 전쟁에 빗대는 견해도 분출했다. 유태인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래서 금융 위기의 근본적 원인 또한 세속화와 서구화 자체에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만이 근본적 해법이라 주장했다.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설득력도 떨어진다. 1997년 금융 위기를 함께 겪은 태국(타이)이나 한국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극히 내부적인 발언이라고 하겠다. 마하티르의 집권 세력과 척을 지고 무슬림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내수용 언설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음미할 대목 또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당대의 지배 질서가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지점은 부정하기 힘든 진실이다. 종교와 철저히 단절된 세속주의가 경제 위기의 근원이라는 지적 또한 막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온 프라센지트 두아라의 독법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 : 프라센지트 두아라와의 대화)
게다가 이들은 서구의 자본주의만큼이나 마하티르의 경제적 민족주의에도 비판적이었다.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 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부터 호사스러운 새 총리 관저까지 낭비가 심한 건설 프로젝트를 단호하게 성토했다. 절제와 검소를 강조하는 이슬람 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은 그런 대규모 사업이 서구가 비판하는 정경유착과 부패의 핵심 고리이기도 했다. 집권당과 결탁한 친인척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파스가 더 많은 경제 개방과 더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IMF와 달리 독자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슬람 경제'로의 전환이었다. 문득 갈팡질팡하던 새내기 시절 읽었던 또 다른 책들이 떠올랐다.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이상호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펴냄) 등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교 경제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종교(영성)와 경제(세속)의 재결합을 꾀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이슬람과 불교의 차이를 넘어 공명하는 바가 있었다.

▲ 말레이시아 익스프레스 버스
2057 : 예습
1950~60년대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출범했다. 그러면서 자국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던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제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듯 일부는 소련을 전범으로 삼아 사회주의로 기울었다. 반면 자신의 문명에 근거한 변화를 꾀하는 쪽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슬람 부흥(dakwah) 운동이 그것이다. 더불어 이슬람 경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엽에 이미 독자적인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는 정책 실험이 시작되었다. 이란, 수단, 파키스탄이 선도적이었다. 즉 '경제의 이슬람화'는 새 천 년에 불쑥 등장한 핫 트렌드가 아니다. 20세기 후반, 이슬람 세계의 탈식민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산, 심화되어온 것이다. 일종의 이슬람 판 '개혁 개방'이다.
이슬람 경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추구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환상, 혹은 허상에 도취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추구를 맹목적으로 숭배한다. 반면 공산주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인 지배와 억압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이슬람 경제는 개인의 이익 및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다. 애초 종교와 경제,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은 불가분이었다. 근대 경제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 생활만을 절대시하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는 인간 생활의 한 요소일 뿐이다.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미쿠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거는 역시 이슬람의 성경, 코란이다. 코란은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 상업과 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를 독려한다. 빈부 차이 또한 속세의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가진 자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정의로워야 하고, 동정심을 발휘해야 한다. 생산적 경제 활동이 곧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예배와 합치되도록 살아야 한다. 그래서 코란은 사기, 독점, 매석, 투기, 고리대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도박성, 불확실성, 착취적 요소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일절 금지시킨 것이다. 무함마드가 메디나를 통치했던 마다니 사회(masyarakat madani)가 이상적인 이슬람 경제의 원형적 모델로 거듭 환기되었다.
말로만 그치지도 않았다. 파스가 집권한 지방이 실제로 있었다. 클란탄(Kelantan) 주와 트렝가누(Trengganu) 주가 대표적이다. 중앙의 세속적인 암노 정부에 맞서서 이슬람 사회를 건설하는 실험장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정 국가'의 비관용성과 종교적 극단주의만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야말로 또 다른 비관용성과 극단주의의 산물이다. 이참에 살펴보니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일단 지방과 농촌에 기반을 둔 정당답게 '農本(농본)'을 중시했다. 도시 중산층을 핵심 지지층으로 삼는 암노와 달리 농업과 산업의 공진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집권 5년 만에 클란탄 주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로 탈바꿈시켰다. 사회 복지의 향상과 부패의 척결도 돋보였다. 농민층의 빈곤율은 크게 떨어졌고, 출산 휴가는 60일로 크게 늘어났다. 저렴한 공공 주택 보급도 확산되었다.
주지사가 앞장서서 일상의 변화도 선도했다. 이슬람 교사 출신의 주지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다. 사치와 낭비 대신에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그 자신이 몸소 '깨끗한 정부'의 상징이 된 것이다. 정신과 물질의 균형과 조화도 도모했다. 오피스, 쇼핑 센터, 호텔 등 상업과 관광이 발전하는 만큼이나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학교도 늘어났다.
고리대를 없앤 이슬람 전당포도 성업을 이루었다. 이슬람 경제에서는 이자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전당포에서는 대여금 이자 없이 저렴한 수수료만 부가하도록 했다. 혹시 기일 내에 갚지 못하더라도 저당물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매에 붙여 대여금과 밀린 수수료를 공제하고는 차액은 저당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코히랄(Kohilal) 이라는 생활협동조합도 눈길을 끈다. 식품과 화장품 등 신체와 관련된 이슬람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대항마로써 이슬람적 생산-소비망을 개척한 것이다. 전자를 이슬람 금융의 원형으로, 후자를 할랄 산업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슬람 경제의 창조적 근대화를 꾀한 지방 정부의 실험이 새 천 년 말레이시아의 국책으로 승격된 것이다.
1997년과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서구 자본주의에 맞서 '아시아적 가치'를 항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슬람 경제로부터 대안적 발상을 얻고 현장에서 실험하며 부단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역동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이슬람 세계에도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식 세속화도 아니요 중동식 근본주의도 아닌, 이슬람의 새 출로와 새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독립 100주 년을 맞이하는 해는 2057년이다. 21세기의 한복판, 말레이시아의 장래와 이슬람 세계의 미래를 예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슬람 금융과 할랄 산업의 현재를 한층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유라시아 견문] 새 경제 : 할랄 스트리트
"은행 이자는 간통보다 36배 나쁘다"
이슬람 은행
출발에는 역시 이슬람이 있었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다. 말레이시아는 그 13억 이슬람 세계의 동쪽 끝에 자리한다. 거리가 가장 멀다. 응당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메카 순례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곤 한다. 약 50년 전, 순례자 자금 위원회(Lembaga Tabung Haji)가 출범한 까닭이다.
처음에는 오로지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저축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예금액이 금세 불어났다. 신도는 많았고, 신심은 두터웠다. 그래서 그 목돈을 종자돈 삼아 투자 및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 대성공이었다. 밑천이 원체 든든했기 때문이다. 순례자 자금 위원회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손이 큰 기관 투자의 하나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차이는 있었다. 메카 순례를 위한 자금이니만큼 철저하게 이슬람의 원칙에 충실해야 했다. 이슬람 은행의 원조이다.
코란은 이자, 아랍어로 리바(riba)를 금지한다. 실질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에 바탕을 둔 경제 활동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물 경제와 유리된 금융 경제, 즉 돈 놀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며, 금융은 실물 경제를 살찌우는 방편일 뿐이다. 하여 자본 자체에 대한 투기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킨다. 돈이 돈을 벌어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자 수취 또한 금기 사항을 일컫는 하람(haram)에 해당되는 것이다. 심지어 간통보다 36배나 나쁜 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셈이다. 내세의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슬람 은행이 번성할 수 있는 문화적 기저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은행이 본격화된 것은 1983년이다. 1981년 마하티르 정권이 출범하고, 2년 후에 이슬람 은행법이 제정되었다. 이슬람 말레이시아 은행(Bank Islam Malaysia)도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무이자 은행 계획(Interest-free Banking Scheme)을 도입하여 기존의 상업 은행에서도 이슬람 금융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말레이시아의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 개혁 개방의 방향은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슬람 세계로 문을 활짝 열었다. 걸프 만 국가들의 이슬람 금융 기관들이 말레이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다.
쿠웨이트의 파이낸스 하우스(Finance House),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지(Al Rajhi) 은행, 카타르의 아시안 파이낸스(Asian Finance) 은행 등 대표적인 이슬람 은행들이 말레이시아에 속속 진입했다. 이를 발판으로 2006년에는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 센터를 설립하고, 이슬람 은행 및 이슬람 보험에 대한 외화 거래를 승인했다. 아울러 이슬람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 촉진을 위한 이슬람 국제 감독 기관도 발족시켰다. 의장국 또한 말레이시아가 맡았다.
2015년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16개의 이슬람 은행이 있다. 그 중 10개가 국내 자본이고 6개가 해외 자본이다. 그 밖에 6개의 개발 금융 기관, 7개의 투자 은행, 2개의 상업 은행이 이슬람 창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슬람 은행의 번창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역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은행인 알라지 은행의 간판이 번쩍거리고, 중심가에는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이슬람 은행들이 좋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고객들도 숱하게 목도할 수 있다.
현재 이슬람 금융의 자산을 합하면 약 4950억 링깃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금융 자산의 25%를 차지한다. 그 비중은 확대일로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아성에 도전하는 '할랄 스트리트'의 야심마저 싹튼 것이다.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하철 역 ATM. ⓒ이병한
할랄 스트리트(Halal Street)
2008년 이후 이슬람 은행의 금융 자산은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위기 무렵 1500억 링깃이던 것이 2008년까지는 1800억 링깃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4년에는 4000억 링깃으로 폭증했다. 2020년에는 6500억 링깃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 속도는 기존 금융 기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만큼 전통적인 상업 은행과 투자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이슬람 금융 시장으로 옮겨 가는 '개종'의 추세가 뚜렷하다. 무슬림의 울타리를 넘어 만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뉴욕과 런던이 주도했던 금융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안정과 안전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북대서양 금융 시스템의 동요에 때를 맞추어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허브를 지향한다. 쿠알라룸푸르를 런던과 뉴욕에 버금가는 '이슬람 세계의 월스트리트'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리-문명적 위치부터 절묘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리비아 등 이슬람 산유국들은 막대한 국부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자금들은 뉴욕과 런던의 금융 시장으로 재투입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선진적인 이슬람 금융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이 자본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산업 벨트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즉, 자원과 자금이 풍부한 서아시아와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이 된 동아시아를 이슬람 금융으로 엮어내는 것이다. 중동 국가들과는 이슬람의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다는 장점 또한 십분 활용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 만달라 세계의 브로커로서 '온라인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표준화와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다.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울러 이슬람 세계가 원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샤리아, 즉 이슬람 율법과 금융을 접목시키는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 이 표준화된 이슬람 금융에 특화된 고급 인력들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우선 2006년 설립한 국제 이슬람 금융 교육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CEIF)가 주목된다. 석·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이슬람 금융 지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독보적인 학술 기관이다.
직접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근방에 자리한 캠퍼스는 근사했고, 교수진은 이슬람 세계의 주요 대학 출신들로 포진되었으며, 유학생들의 분포 또한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전 세계를 망라했다. '이슬람 대학'인 동시에 '글로벌 대학'인 것이다. 이슬람 율법과 금융 양면에 모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슬람 금융에서의 '말레이시아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겠다.
2008년에 출범한 국제 샤리아 아카데미(International Shariah Research Academy, ISRA)도 주목할 만하다. INCEIF가 교수와 학생 간의 글로벌 연결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 ISRA는 이론과 실무의 결합, 대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곳이다. 이슬람 학자들과 은행가 및 경영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과 경제학의 실용적 합류를 도모하는 일종의 實學(실학) 기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아랍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사업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슬람 경제 및 이슬람 금융에 관한 '신지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근대의 좌/우파 경제학과는 일선을 긋는 '신 경제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새 경제
어렵사리 압바스 미라코르(Abbas Mirakhor) 박사를 만났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라고 한다. 이 분도 전직 IMF 관료에서 INCEIF의 교수로 '개종'한 경우이다.
그는 이슬람 금융이 30년의 맹아기를 거쳐 도약기에 들어섰다고 전망했다. 모기지(mortgage)처럼 투기성이 강한 금융 공학을 거절한 점이 왕년에는 이슬람 금융의 한계라고 지적되었지만, 이제는 전 지구적 금융 공황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독자적인 이슬람 주식 시장을 만들어서 이슬람 기업들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이슬람형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가 으뜸으로 꼽는 이슬람 금융의 미덕은 리스크의 공유였다. 금융의 기본은 돈을 빌리고 갚는데 있다. 빚에 기초하는 계약 관계이다. 그런데 기존의 금융에서는 그 리스크를 채무자에게 떠넘긴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늘 갑을 관계이다. 반면 이슬람 금융은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운명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제때에 갚으라고 채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채권자의 책무가 된다. 돈을 빌려준 만큼 그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부채가 도리어 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윤은 물론이요 손실까지도 공유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고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윤리적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응당 사회적인 안정성도 강화된다. 상부상조에 기초한 공유 경제의 한 형태이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리스크의 전이와 전이로 연쇄 파국을 초래한 파생 상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이다.
솔직해지자면 생산적인 인터뷰가 되지 못했다. 내가 원체 금융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다. 주식은커녕 적금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과 이슬람 금융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대목에서 긴가민가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다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에 대해서도 감이 잡히질 않았다.
실감이 부족하니 수긍도 비판도 쉽지가 않았다. 자연스레 다음 질문의 심도가 떨어졌고, 대화의 밀도 역시 약해졌다. 밍밍한 질문이 이어지니 미라코르 또한 심드렁해지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당황했고, 영어마저 꼬여갔다. 질문과 대답 사이, 침묵의 터울이 길어졌다. 갈수록 서로 민망했다. 녹취 파일을 문장으로 옮기고 있자니, 당시의 적막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재차 식은땀이 흐른다.

▲ 국제 이슬람 금융 교육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CEIF) 캠퍼스 내부의 모스크. ⓒ이병한
연구실을 나오자 해방감이 일었다. 바깥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다. 새 기운은 이미 캠퍼스에도 여실했다. 이슬람 경제를 특화시킨 대학이 들어섰다는 사실부터가 신선한 것이었다. 가정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경영학과 경제학이 완전히 영미권에 종속되어 있는 작금의 한국 대학들에 견주자면 부럽기 짝이 없었다.
잘 가꾸어진 캠퍼스를 따라 걸으며 21세기의 '혁명'이란 이런 것일까, 잠시 궁리했다. 머지않아 2017년이 된다. 19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다가오는 것이다. 2017년의 혁명은 1917년의 그것과는 무척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1979년의 이란 혁명에 더 근사할지 모른다.
이란 혁명은 이슬람 세력이 최초로 근대 국가의 권력을 차지한 일대 사건이었다. 이슬람이 근대를 타고 오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2년 후에 마하티르가 말레이시아의 총리로 등장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발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보니 그것 또한 이슬람 혁명의 후폭풍이었다.
대처와 레이건의 집권으로 신자유주의가 닻을 올리고 있던 시기에, 또 소련이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사회주의 제국주의'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던 시기에,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이슬람의 근대화'가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것이다. 과연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는 지난 1000년을 돌아보는 만큼이나,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데에도 유효한 독법이다. 게다가 1979년이 바로 중국의 개혁 개방이 출발한 해라는 점까지 덧붙인다면 유라시아 전체를 아울러 '세계화'의 실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현재의 나로서는 이슬람 금융의 실제가 어떠한지, 과연 기존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슬람 근본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슬람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조류가 도저함을 새삼 확인했다고 하겠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견문은 이제 초입부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변방 국가를 둘러보았을 뿐이다. 이슬람은 유라시아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문명권이다. 14억 중국, 13억 인도와 더불어 인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행위자가 아닐 수 없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슬람 국가들을 계속 방문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이슬람', '이슬람의 근대화'를 화두로 삼기로 한다. 이슬람의 성경, 코란부터 읽어보아야 하겠다.
지금 당장 추적이 가능한 것은 생활상의 변화이다. 무릇 제도와 사상, 가치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에 기초하기 마련이다. 먹고, 입고, 자고, 노는 하루하루의 변화가 관건이다. 그 생활세계에서도 '이슬람의 근대화'는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할랄 산업의 대약진이다. 소비 생활이 갈수록 이슬람화되고 있다. 살펴보기로 한다.
[유라시아 견문] 할랄 산업 : 글로벌 이슬람
먹을거리 덮친 이슬람 쇼크, 맥도날드도…
할랄의 근대화
쿠알라룸푸르 입성 첫날밤, 캔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이슬람 국가라 그런지 숙소 근방에 마땅한 술집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놀랬다. 온통 할랄 상품이었다. 우유, 요구르트, 커피, 초콜릿, 식용유, 케첩, 치즈, 마요네즈, 라면, 통조림 등 거의 모든 식품에 할랄 로고가 부착되어 있었다. 코카콜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치약과 샴푸 등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였다.
할랄 식당도 굳이 찾아다닐 이유가 없었다. 대부분이 할랄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10여 년 전만해도 공간적 분리가 여전했다고 한다. 할랄 식당은 말레이계나 인도계가, 비할랄 식당은 화교, 화인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러던 것이 할랄 인증이 널리 보급되면서 중국 요리마저 할랄화된 것이다.
중화요리에 필히 들어가던 돼지고기와 돼지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재료로 대체함으로써 말레이인들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화요리와 말레이 요리가 혼종된 퓨전 음식을 뇨냐라고 부른다. 이 도저한 흐름에 패스트푸드도 예외일 수가 없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헛 등 글로벌 브랜드도 몽땅 할랄 로고가 붙여져 있다. 사실상 비할랄 식품과 식당은 공공 장소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혹은 화인들만 사는 공간으로 주변화 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이슬람 소비 공간의 확산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겠다. 소비 공간 자체가 이슬람화되고 있다.
할랄(Halal)은 하람(Haram)과 짝을 이루는 말이다. 할랄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면, 하람은 이슬람 율법이 금지한 것을 뜻한다. 애초에는 주로 식품에 해당되었다. 야채, 과일 및 해산물이 할랄 음식이다.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알코올 및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할랄에 해당된다.
특히 육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만을 할랄로 삼는다. 이슬람 도살(Zabiha)은 규정이 꽤나 엄격하다. 목젖 바로 아래 식도와 기도 사이, 동맥과 정맥을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베어야 한다.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도살 직전에는 반드시 알라에게 기도도 드려야 한다.
이 오래된 전통의 근대화는 1970년대부터 추적할 수 있다. 탈식민과 더불어 이슬람 부흥을 추구하는 다콰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제1야당 파스 또한 이슬람에 바탕을 두었다. 민간과 야당이 합작하여 세속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1980년대 마하티르 총리의 이슬람화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국가 차원에서 받아 안은 것이다.
이교도(kaffir)라는 치명적 비판을 피하고 무슬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슬람 부흥 운동의 주도 세력이 중산층 지식인과 대학생이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자긍심을 갖고 이슬람적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 집합적으로 부상한 것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도 한몫했다. 1970~80년대를 걸쳐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개되었다. 지방과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활발해졌다. 그 전까지 도시는 화교/화인들이 주류였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화인, 농촌은 말레이인이라는 공간적 분화가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식사 공간이야말로 민족/인종 간 갈등을 구현하는 첨예한 정치적 장소가 되었다. 설사 돼지고기가 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리 기구와 식기가 돼지기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레이인과 화인 간의 일상적 교류가 차단된 것이다. 다민족 국가 말레이시아의 '국민 통합'에 지대한 장애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도시는 세계화의 장소이기도 했다. 속속 진입하고 있던 서구의 패스트푸드점 또한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오염된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 일국의 사회 변동과 지구적 변화가 대도시에서 접목되면서 '할랄의 근대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이다. 말레이인의 인구가 커지는 만큼 할랄 음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해가 1994년이다.
그로부터 20년, 말레이시아의 일상은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삼시세끼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할랄 인증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정육 코너에서 할랄 육류와 비할랄 육류가 분리되어 진열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구별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대개의 곳에서 오로지 할랄 육류만 판매한다. 이미 할랄 인증제는 식품을 넘어, 화장품, 세면품은 물론 약품과 의복, 물류 및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할랄 호텔도 생겼다 한다. 이슬람의 율법이 근대의 세속법으로 전환되어 시민들의 일상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응당 할랄은 이슬람의 윤리적, 미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무엇이 정갈한지 불결한지, 유익한지 해로운지,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슬람적 가치 판단과 미적 취향이 근대 법률의 형식으로 탈바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슬람적 생활 방식은 한층 더 보편화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포스트모던 건축물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의 지하 푸드 코트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재차 '지구적 근대'라는 개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포스트모던의 실상은 '탈근대'가 아니라 '탈서구적 근대'의 개창이었다.

할랄의 세계화
할랄의 근대화는 말레이시아로 그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이집트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펼쳐져 있는 13억 무슬림 형제국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중국 등에 산재해 있는 무슬림 소수 집단까지 합하면 16억에 달한다. 인구 증가도 가장 빠르다. 21세기 중엽이면 30억에 육박하여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종교/문명으로 (재)부상할 것이다.
할랄은 더 이상 특정 종교 집단의 신기하고 예외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다. 거대한 글로벌 시장의 일부이다. 고로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주도하고 있는 할랄 인증제 또한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편이 온당하겠다.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은 상품 및 소비재, 식품, 도축 및 도살의 세 가지 범주에서 발급된다. 제품의 생산과 취급, 보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할랄 로고가 부여된다. 식품의 가공, 포장, 운반, 저장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할랄의 기준을 따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식당 또한 1차 식재료는 물론이요, 가공 식품 재료, 소스에 대해서도 입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 재료를 포함해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또한 모두 할랄 인증을 받은 회사이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스레 독자적인 할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세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원산지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 식품 생산 과정 자체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 가공업자, 상인 간 세계적 연결망의 모든 과정이 할랄화함으로써 전 지구적 파급 효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21세기의 청사진으로 할랄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것은 합당한 국가 전략으로 보인다. 식품 산업의 세계화와 더불어 식품 안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 시점에 할랄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이며, 영성적인 식생활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적 생활양식의 시장화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에 이어 총리직을 계승한 이가 압둘라 하지 아마드 바다위(Abdullah Haji Ahmad Badawi)이다. 그는 2004년 8월 1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첫 번째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박람회(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MIHAS)에서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의 허브"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2006년 종합적인 정부 구상을 발표한다.
대표적인 것이 할랄 산업 단지(Halal Parks)의 조성이다. 현재 13개로 늘어난 할랄 파크는 할랄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동식물의 재배와 사육부터 보관, 운송, 포장에 필요한 전 영역에서의 기반 시설을 국가가 제공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수입 관세와 법인세 감면의 혜택도 부여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투자도 유도하고 있다. 할랄 산업, 무역, 서비스의 집결 장소이자, 할랄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예외적인 자유 무역 지대인 것이다.
할랄 박람회 또한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세계 각국, 각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간 로스앤젤레스, 자카르타, 파리, 브루나이, 두바이, 멜버른을 순회하며 개최되었고, 2015년 올해는 대만(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할랄 박람회는 이미 이슬람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슬람적 세계화'의 상징적 현장이 된 것이다. 이슬람적 소비 문화를 만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이벤트가 되었다.
할랄 무역으로 말레이 세계의 복원과 확장을 꾀하는 흐름도 있다. 화교 네트워크와 인교(印僑) 네트워크에 못지않은 말레이 디아스포라의 지구적 연결망을 (다시)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말레이 중산층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주의의 발현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가교로서 번영을 구가했던 말라카 왕국의 영화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20세기를 거치며 말레이 세계의 해양 네트워크가 이제는 런던과 리버풀까지 미친 것이라는 역설적 독법도 가능하다.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중산층 자녀들이 식민 모국인 영국에 유학 감으로써 부지불식간 말레이 세계의 확산과 심화에 일조한 것이다. 이들은 일정한 재력에 학력 자본까지 결합함으로써 할랄 산업을 발판으로 삼은 말레이 세계의 지구화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말레이타운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이 글로벌 중화 세계의 허브가 되었던 것처럼, 말레이타운을 통하여 작게는 말레이시아, 크게는 글로벌 무슬림 세계의 연결망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영국에만 200만 이상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런던 인구의 10%가 무슬림이다.
말레이타운이 글로벌 움마(Ummah, 이슬람 공동체)의 촉매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셈이다. 이로써 한때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연결했던 이슬람 무역망의 황금 시절을 복구하겠노라고 하니, 재차 새 천년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실상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구상은 이미 일부 실현되고 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한 유럽 최초의 할랄 산업 단지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들어선 것이다. 독일에서 이주한 터키 무슬림, 영국에 이주한 파키스탄 무슬림, 프랑스에 이주한 알제리 무슬림 등, 이슬람 디아스프라의 정체성 찾기의 일환으로 할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식품 기업 네슬레도 할랄 산업에 뛰어들었다. 무슬림에게 좋은 것은 만인에게도 좋다며 할랄 로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할랄 상품 수출 또한 증가일로이다. 위구르족과 회족은 물론, 중국의 주요 산업 지역에 진출한 아랍 상인들의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족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할랄 음식을 먹고 할랄식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이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일상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중국까지, 유라시아의 동서를 아울러 할랄의 세계화가 도저하다.

할랄의 미래
근대 사회과학의 전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근대화는 곧 세속화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전통을 버려야 근대로 진입하는 것도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를 바탕으로 근대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화, 근대화,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슬람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아니 종교 자체가 가장 유력한 시장이 되고 있다.
소비의 할랄화야말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이슬람 중산층이 추구하는 구별 짓기의 핵심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복고풍과는 일선을 긋는 이슬람의 改新(개신) 운동이라고도 하겠다. 이를 통하여 런던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진열대까지 재편하는 '세계화의 역류'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할랄 식품과 식당은 윤리적 소비라는 최신의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건강한 밥상과 올바른 섭생에 대한 현대 소비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음식은 더 이상 영양의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영혼의 욕구도 만족시켜 줘야 한다. 칼로리의 경제에서 영성적 경제로의 전환, 영양과 영성의 공진화에 할랄 산업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당장 서점의 요리책 코너에서도 할랄 조리법에 관한 책들이 유독 많았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할랄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 책자도 흥미로웠다. 유럽과 미주,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할랄 식당을 소개하며 별표를 매기고 있었다.
가령 런던의 빅벤(BIG BEN)을 배경으로 베일을 걸친 무슬림 여성이 '평화로운 영혼의 여행'을 안내하는 식이다. 오염된 음식에 대한 걱정일랑 떨쳐두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객들이 세계 각지의 표지판에 한자를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 여행자들은 할랄 식당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할랄의 중국어 번역은 '淸眞(청진)'이다. 청결함과 진실함의 합성어이다. 이슬람은 본디 깨끗함에 기초한 종교이고, 청결이 신앙의 절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몸의 정갈함은 내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다, 이것이 불문율이다. 나아가 영성적 측면에서도 정갈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자신을 순수하게 가꾸어야 한다. 이처럼 국지적 맥락에서 더 신실한 신도의 증표였던 할랄이 전 지구적 소비생활과 결합하면서 더 좋은 삶, 더 건강한 생활, 잘 먹고 잘 살기의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랄의 미래는 창창하다. 할랄 인증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하다. 살충제와 제초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근대식 농법에도 개입할 수 있다. 동물의 공장식 사육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동물성 사료에 대해서도 이슬람 윤리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 유기농법만이 할랄 식품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면적인 할랄화가 녹색 기술,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결합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 무역을 비롯한 교역의 윤리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앞으로 무슬림이 차지하게 될 인구 비중과 이들의 종교적 실천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수가 있다.
과연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불공정 무역 등 전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슬람적 대안의 제시가 가능할까? 종교와 과학이 해후하고, 영성과 세속이 합류하고, 신성과 이성이 재결합하는 풍경을 이슬람 문명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두고두고 면밀히 관찰할 주제이다.
일단 소구력만은 충분한 것 같다. 쿠알라룸푸르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나는 할랄 샴푸로 머리를 감고 할랄 치약으로 이를 닦고 있다. 매일 아침 나도 지구도 건강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가히 나쁘지 않다.

▲ 말레이시아 국립 대학교의 할랄 푸드 코트.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필리핀 : 속국의 민주화
'산 미구엘' 맥주에 담긴 필리핀 '슬픈 민주주의'
피플 파워 vs. 가문 정치
다음 행선지는 필리핀이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마닐라까지, 남중국해를 가로질렀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이지만, 국가의 성격은 전혀 판이했다. '아시아적 가치'를 앞장서 표방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필리핀은 '아시아 속의 서구'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일단 국명부터가 '필리핀',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에서 따 온 것이다.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세부에 정박한 이래, 필리핀은 말레이반도보다 멕시코와 더 가까웠다. 남중국해의 바닷길보다는 '스페인의 호수'라 불렸던 태평양의 겔론선 무역망이 더 촘촘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예외적인 천주교 국가이자,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인문 지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아시아보다는 차라리 아메리카와 더 유사한 구석마저 있다. 스페인 300년과 미국 100년, '천주'와 '민주'의 결합이 오늘의 필리핀을 주조한 것이다.
마침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있었다. 매년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의사당 밖에서는 다양한 시민 단체의 찬반 집회도 열리고 있었다. 뜻하지 않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접한 것이다. 루손 섬의 전통 의상을 차려 입고 의사당에 등장한 주인공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었다. 지난 5년에 대한 자평과 남은 1년에 대한 다짐이 연설의 주조를 이루었다. 필리핀은 6년 단임제이다.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아키노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것은 2010년이다. 바람을 타고 일어난 반짝 스타였다. 부모의 후광 탓이 컸다. 가문 정치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아버지 니노이 아키노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순교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어머니는 필리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코리 아키노이다. 그래서 가문의 텃밭인 탈락(Tarlac)에서만 내리 세 차례 하원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마땅한 업적은 없었다고 한다. 능력과 자질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급부상한 것은 어머니 아키노 여사의 죽음(2009년) 때문이다. 장례식이 국장으로 엄수되었다. 그녀에 대한 향수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결국 혈육인 아들에게로 옮겨 붙었다. 하루아침에 유력 후보가 되어 대권을 움켜쥔 것이다.
돌아보면 어머니 아키노가 대통령이 된 과정도 판박이였다.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정적이었던 남편이 암살당하자, 전업주부로 살던 그녀가 대항마로 부상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된다. 1986년이었다. 그리고 1987년 '민주 헌법'이 입안된다. 역사는 당시를 '피플 파워(People Power)'로 기록하고 있다. 1972년 계엄령 이래 철권을 행사하던 마르코스 독재정부를 민중의 뜻/힘으로 타도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얘기이다. 듣기에도 흐뭇하다. 그녀는 즉각 세계적인 명망가, 민주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듬해 태국(타이), 대만(타이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종종 등장했다.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도미노를 촉발한 '87년 체제'의 원조였던 것이다. 아웅산 수치에 앞서 코리 아키노가 있었다. 그러나 그 달뜬 환호 속에서 가문 정치의 유산은 스리슬쩍 가리었다.
아키노를 가장 환대한 곳은 미국이었다. 1986년 9월 취임 후 첫 순방으로 방미 길에 오른다. 레이건 행정부는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가족 만찬'을 베풀었다. 필리핀은 미국과 역사를 공유하고 이상을 공유하는 '형제국'이라 했다. 상하원 합동 연설의 영예도 부여되었다. 의원들도 '코리! 코리!'를 외치며 기립 박수로 환영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끝내 아시아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유창한 영어 연설 또한 그녀가 'Made in USA'의 산물임을 확인해주었다. 남편이 암살된 83년부터 그녀는 3년 동안 보스턴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민주주의를 본토에서 완수시키고, 그 사상적/정치적 고향으로 귀환한 꼴이다. 여기서도 마르코스의 막후 지원자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은폐되었다. 아키노의 가문 정치와 미국의 후원 정치를 도려냄으로써 필리핀 민주주의의 대서사, '피플 파워'의 신화가 완성된 것이다.

▲ 필리핀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 다양한 찬반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 단체. ⓒ이병한
식민지 근대화
월든 벨로(Walden Bello)를 만났다. 필리핀에 가자니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다. 대학 시절부터 그의 글과 책을 종종 접했다. 비판적 사회학자이자 왕성한 현장 활동가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반군사주의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권위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마닐라 만이 내다보이는 아담한 야외 카페에서 맥주를 곁들여 담소를 나누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요즘 가장 주력하는 사안은 중국의 인공 섬 건설 반대와 미군의 필리핀 재진입 저지였다. G2 간 알력다툼의 그림자가 필리핀에도 물씬 드리운 것이다. 다만 필리핀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중국 봉쇄와 일대일로의 차단에 선봉대가 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역할을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이 떠맡은 것이다. 그의 근심이 깊은 것은 이러한 치우침이 하루 이틀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100년의 업보이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1898년이다. 미국-스페인 전쟁은 20세기를 여는 일대 사건이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힘의 축이 옮아갔다. 미국이 미국 밖에서 벌인 최초의 전쟁이기도 했다. 미군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 파병된 것이다. 그 후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등 미군은 아시아를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아시아야말로 미국의 새로운 프런티어였고, 필리핀은 그 첫 교두보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최초의 독립국가라는 명예가 빛났다. 그래서 필리핀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라는 담론을 적극 유포했다. 또한 자애로운 동화(benevolent assimilation) 정책을 펼쳐 필리핀의 근대화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겠다. 꽤나 잘 먹혀들기도 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개 미국에 호의적이고 친근한 편이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인이 영국에, 베트남인이 프랑스에, 인도네시아 인이 네덜란드에 대해 품는 감정과 결이 매우 다르다.
우선 그들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전통을 파괴했다는 실감이 덜하다. 미국 앞에는 스페인이 있었을 뿐이다. 그 전에는 '필리핀'에 견줄 만한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필리핀에는 베트남 후에(Hue)의 황궁 같은 것도 없으며, 앙코르와트나 보로부두로 사원 같은 거대한 종교 건축물도 없다.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동원할 수 있는 저항의 자원이 부족했다.
독립운동의 거개가 민족사, 민족 문학 등 '정신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단일 왕조, 단일 언어, 보편 종교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필리핀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필리핀의 지배층조차 그 수백 년의 서구화 및 식민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응당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에도 반감이 덜했다. 아니 오히려 미국식 근대화에 호감을 가졌다. 미국은 스페인에 견주어 훨씬 너그러웠다.
필리핀에 부임한 첫 총독이 윌리엄 테프트이다.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던 바로 그 인물이다. 1900년부터 1913년까지 부임했고, 훗날 미국 본토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는 총독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선교사의 태도로 임했다. 행정기구의 이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영국과는 달리 식민(Colonial)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필리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이름에도 '섬(Bureau of Insular Affairs)'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그마한 갈색 형제들'에게 근대화의 혜택을 베풀었다. 항만과 도로를 건설해서 국민 경제를 통합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미국의 '원어민 교사'들을 전국에 파견하여 영어를 '국어'로 가르쳤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당선은 또 한 번의 변화였다. 본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한층 '진보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필리핀의 필리핀화'가 시작된 것이다. 1907년에 의회가 생긴데 이어, 1935년에는 자치권도 부여받았다. 10년 후에는 독립도 약속받았다. 더불어 민주주의도 하사받았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예가 필리핀에게 수여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과는 역설적인 것이었다. 독립 이후에도 문화적, 정신적 식민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것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예속의 바탕이 되었다. 당장 마닐라의 주요 거리 이름부터 미국인들이 두드러진다. 테프트와 해리슨을 비롯하여 매킨리, 윌슨, 루스벨트 등 역대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아가 록펠러, 포드, 에디슨, 맥아더 거리도 있다. 일상어에도 미국의 영향은 깊숙하다. 치약(Toothpaste)이라는 말 대신에 콜게이트(Colgate)가 통용될 정도이다.

▲ 필리핀 마닐라 테프트 거리. ⓒ이병한
문득 동두천 카투사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근무하던 부서의 노총각 상사가 필리핀 아가씨와 결혼했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기지에 의존하며 살았던 여성들이 용산으로, 동두천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아이까지 낳았는데 동네 의사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들락거렸다.
주민들의 눈총은 따가웠지만, 이런저런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남편 따라 미국 가는 것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의의의 대답이 돌아왔다. 서슴없이 '미국은 또 다른 고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인적 연결망이 넓게 퍼져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인이 필리핀 사람들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들이 적지 않다. 인구의 약 10%인 1000만 필리핀인들이 해외에서 보내오는 '송금 경제'가 가정과 나라 살림의 주축이기도 하다. 지금도 매년 300만 명의 필리핀인이 미국을 방문하고, 400명을 뽑는 미 해병대에는 필리핀 출신만 10만 명이 지원한다.
내 짧은 회고담에 벨로는 한 술 더 뜨는 일화로 화답했다. 1980년대 그가 오래 교유하던 한 마오이스트 반군 지도자가 감옥에서 탈출하더니 베이징이나 하노이, 모스크바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로 망명하더라는 것이다. 그들은 마오쩌둥의 모순론과 실천론도 영어로 학습했다. 반체제 세력까지도 식민과 냉전이 빚어낸 지리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91년 미군 철수가 마냥 달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미국 없는 필리핀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다. 냉전기 필리핀에는 세계 최대의 공군 기지가 클락에,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가 수빅 만에 있었다. 그들이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로 떠나자 필리핀 정부는 기지를 관광지로 재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퇴직한 미국 군인들을 초청하는 역설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현역 미군들이 떠난 지역 경제를 부활시켜 줄 구원자로 퇴역 군인들을 모집한 셈이다. 가령 수빅 만에는 정글 환경을 체험하는 생존 훈련 캠프가 차려졌다. 베트남 전쟁 당시 열대우림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 훈련지로 삼았던 곳을 '에코 투어'의 현장으로 개조한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람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의 기억 또한 굴절되었다.
이처럼 필리핀은 기지를 관광지로 전환하여 탈냉전기를 영위하다가, 재차 군사 기지로 변경시킴으로써 신냉전의 첨병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그 역설의 과정이 바로 어머니 아키노에서 아들 아키노로 이어지는 '민주화 30년' 동안 전개된 것이다. 내재화된 아메리카니즘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곡절의 세월을 복기해주던 벨로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마를 가르는 굵은 주름 사이로 막막한 좌절감과 외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종업원을 불러 맥주 두 병을 더 주문했다. 그러고 보니 이 나라는 맥주 이름도 산 미구엘(San Miguel) 이다. 전통과 정통의 감각이 좀체 부족하다. 국가의 품격, 문명의 두께도 기대하기 어렵다.

속국 민주화
필리핀은 서구의 제국주의 통치를 가장 오래 받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300년을 걸치며 스페인인과 필리핀인 간에 탄생한 메스티조 가문이 21세기에도 명문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60여 개 집안의 재력이 1억 국민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 독실한 '천주교'도이자 투철한 '민주교'도였던 아키노 집안 또한 이러한 필리핀 역사의 역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리핀 판 '87년 체제'의 실상 또한 바로 이 가문 정치로의 복귀였다. 마르코스 독재 아래 숨죽이고 있던 지역 명문가들이 아키노를 앞세워 단일 정적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가문 간의 이합집산이 시작되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직선제 또한 명망가 간의 대리전에 불과했다.
정당 정치 역시 허울이었다. 정당은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념 집단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토호들의 이익 집단이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봉건제적 속성이 민주주의 아래서 해소는커녕 더욱 강화된 것이다. 기실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제는 속 깊이 봉건제와 연속적이며 친화적인 구석마저 있다.
그리하여 필리핀 또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앓고 있다. 마닐라 시를 조금만 다녀도 극단적인 양극화, 격차 사회를 실감할 수 있다. 비버리 힐스를 흉내 낸 부촌은 철저하게 요새화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 그 밖으로는 슬럼의 바다가 넓게 펼쳐진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이(有二)한 탈출구가 해외 이주 노동과 범죄라는 말도 있다.
한창 화제가 되었다는 독립 영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의 부제가 "The most dangerous city in the world"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은퇴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야밤에 혼자 나다니는 것이 꺼려질 정도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물론이요 베트남보다도 거너번스가 못하다는 인상마저 들었다.
이 같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실태를 일컫는 몇몇 학술 용어들이 있다. '저강도 민주주의', '대지주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등 여럿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곡을 찌르지는 못한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당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공염불처럼 들린다.
내 보기에 필리핀 민주주의의 불구는 1946년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필리핀의 '의존적 독립(Dependent Independent)' 상태, 즉 속국(Client State)적 속성과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층이 자기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보수층이 자기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자생적 엘리트가 부재하고 기생적 엘리트가 대종이다.
20세기 전반기의 '식민지 근대화'가 20세기 후반기의 '속국 민주화'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하기에 민주주의 아래서도 재식민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에서 독립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라는 20세기의 거대서사 또한 실상을 가리는 기만적 언사, 이데올로기에 가까울 것이다.
벨로의 근심에 나의 수심도 덩달아 깊어진 것은 필리핀의 '속국 민주'가 전혀 남 일로만은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인지 모른다. 게다가 최근의 동향은 불쾌한 기시감마저 일으킨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과 불가분이다. 미-일 간 부당 거래, 빅딜의 소산이었다.
언뜻 흡사한 판이 펼쳐지는 것도 같다. '속국 일본'은 기어코 안보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미군에 종속시키고 있다. '속국 필리핀'도 재차 미군을 자국에 주둔시키기로 했다. 일본-필리핀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 소식도 들린다. 때마침 자위대와 합동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발설했다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도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 가치동맹'이라는 옛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반복이고, 반동의 물결이다. 필리핀이 불안하고, 남중국해가 불길하다.
[유라시아 견문] 혁명과 중흥
갈색의 화려한 부활, '대동 세계'를 꿈꿔라!
견문과 독서
견문의 일상은 단순하다. 보고 듣고, 읽고 쓴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다시 보고 듣고, 읽고 쓴다. 응당 읽고 쓰는 것이 보고 듣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다. 독서의 궤적이 견문의 경로와 오롯이 포개지는 것이다.
한참 西域(서역)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중국 서남단, 운남성의 성도 쿤밍에 머물며 중국의 지리-문명-역사 감각을 새로이 익혀갔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서편, 내 나름의 <西遊記(서유기)>에 주력할 참이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라시아 제국'으로 접근하게 된다.
와중에 한국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강양구 기자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며 서평을 권한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집중력을 흐리고 싶지 않았다. 국내에서 나온 신간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고 여겼다. 요즘에는 새 책보다는 옛 책이 더 흥미롭기도 하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만큼 첨단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래학 서적을 접하지 못했다. 나날이 新書(신서)보다는 古文(고문)을 애호하게 된다.
그럼에도 제목이 솔깃했다. <갈색의 세계사>(비자이 프리샤드 지음, 박소현 옮김, 뿌리와이파리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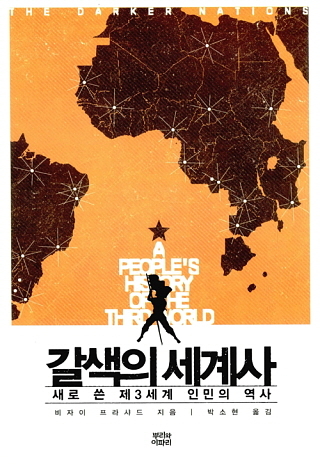
▲ <갈색의 세계사>(비자이 프리샤드 지음, 박소현 옮김, 뿌리와이파리 펴냄). ⓒ뿌리와이파리
부제는 '제3세계 인민의 역사'이다. <유라시아 견문>을 통해 꾀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세계사 다시 쓰기이다. 아니, 다시 쓰기는 과장이고 과욕이다. '세계사 다시 읽기'가 분수에 맞는 표현이겠다. 내심 지난 100년, '20세기사의 재인식'을 도모한다. 그래야 다른 100년, 새천 년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역사 인식의 착종과 답보가 작금 한국의 정체와 퇴행과 무관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갈색의 세계사>는 바로 그 '20세기사의 재인식'에 해당하는 책이다. 경로 이탈만은 아닌 셈이다. 영판 딴 길이 아니라면 잠시 샛길에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향후 견문의 여정을 더 탄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명분도 생긴다. 원저를 검색하니 [Darker Nation]이다.
이번에는 반가운 마음이 일었다. 낯이 익은 책이다. 내 킨들에도 저장되어 있다. 아마존에서 확인하니 올해 3월에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온다. 아마도 인도네시아 견문을 준비하며 구입했을 것이다. 자카르타의 매연과 소음, 반둥의 쪽빛 하늘과 하얀 모스크가 떠오른다.
실제로 저가 항공사만큼이나 전자책의 혜택을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 영어, 중어, 일어판 킨들이 아니었다면 <유라시아 견문>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킨들 버전이 없는 책들은 곳곳의 후배들에게 부탁하여 PDF로 구해서 읽는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책들을 짊어 싸고 다녔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책에 대한 탐심을 줄이고, 읽고 버리는 습관을 익히고 있다고는 해도, 여정이 녹록치는 않았을 것이다. <갈색의 세계사> 또한 출판사가 제공하는 PDF 버전으로 검토했다. 冊(책)의 바인더를 풀어버림으로써, 지식과 정보 또한 모바일-데이터로 변해감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다루는 내용이 원체 광범위하다. 배경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였다. 응당 번역자가 궁금해졌다. 이력을 살피니 역시 특이하다. 영상원에서 이론 공부를 하고,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단다.
당장 연락처를 구해 이메일로 인사를 텄다. 답장에는 반둥 회의 관련 연재 글에서 현지 음 표기를 수정해주는 내용이 달렸다. 싱가포르에서 공부했지만 인도네시아도 자주 드나든다며. 과연, 책과 어울리는 역자이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동남아 견문에 여러 자문을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쉬움마저 인다. 서평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다.
혁명 : <갈색의 세계사>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탐색', 2부는 '함정', 3부는 '암살'이다. 나로서는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린다. 백미는 단연 1부이다. 제3세계 운동의 통사로 손색이 없다. 그 내용의 풍부함과 소상함만으로도 이 책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두고두고 요긴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2, 3부는 갈수록 갸웃했다. 저자 비자이 프리샤드의 관점이 뚜렷한 만큼이나 내게는 편향적으로 보였다. 한마디로 '좌편향'이다. 갈색보다는 '적갈색'에 가깝다. 다분히 제2세계에 기울어진 제3세계를 편애한다. 반둥 회의로 석사 논문을 썼던 20대 시절이라면 일정 공감했을 것이다. 나 자신 빨간 물이 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아프리카 작가 회의 등을 소재로 박사 논문을 썼던 30대에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반둥 회의조차 미소 냉전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통상적인 해석에 족하지 못한다. 유럽의 도래 이전에 작동했던 아프로-아시아 연결망을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사업이었다고 여기는 쪽이다.
실제로 '재건'과 '복원'은 내가 살핀 1차 사료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래서 반둥 회의 또한 이슬람-인도양-중화 세계의 문명 간 연대의 복원 시도였다고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좌/우보다는 고/금,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문명사적 접근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반면 프리샤드가 꼽는 제3세계 프로젝트의 요체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이다. 양대 반체제 운동 및 사상의 발흥과 쇠퇴를 중심으로 제3세계사를 반추하고 회고하고 있다. 그 결과 제3세계 운동 또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혁명'에 대한 애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민족주의와 각종 복고적 사상이 그 빈자리를 대체했음을 애감해한다. 즉, 좌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구체제의 구세력들이 복권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저자의 시각을 빌자면 새 천년 제3세계의 동향은 '전통'을 피난처로 삼아 '근대성'을 거부하는 '반동의 시대'로 접수하게 된다. '반전 시대'를 설파하는 나로서는 마냥 수긍하기 힘들다.
일단 언어의 사용부터 눈에 밟힌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후의 제3세계를 일컬어 '원초적 문화주의', '원시 상태로의 복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또 '종교'는 늘 '근본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문화' 또한 '보수주의'와 결부된다. 종교와 진보, 문화와 개혁은 물과 기름이다. 세속적 혁명만을 드높이고, 제3세계의 전통 문명에는 야박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메카조차도 매우 자의적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미국의 독실한 동맹국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민족주의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곳이다. 그 탓에 이슬람의 전통 또한 매우 왜곡된 형태로 잔존했다고 보아야 한다. 덜 단련되고 세련이 덜 되어, 문자 그대로 '적폐'만 쌓인 것이다.
책의 마무리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혹은 터키와 이란의 이슬람이 아니라 사우디의 메카인 것도 편향적이지만, 책의 출발이 프랑스 파리인 것은 더욱 문제적이다. 파리에서 시작하여 메카로 끝을 맺는 <갈색의 세계사>의 서사 구도 자체가 복병인 것이다.
'유라시아 견문' 작업을 하면서 매일같이 세계 지도를 살피고, 지구본을 돌려보는 습관이 생겼다. 다니면 다닐수록 地理(지리)가 곧 역사의 주체라는 생각이 깊어진다. 天地人(천지인)이라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만을 유독 역사의 주체로 내세웠던 근대 역사학의 전제 자체를 회의하고 있다. 天時(천시)와 지리를 누락하고 말았기에 인류의 '보편적 진보'라는 허황한 망상도 가능했던 것이다. 유물사관조차도 뜬구름이었다.
<갈색의 세계사>에서 거명되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세계 지도에 찍어 보았다. 카라카스와 아루샤 등 낯선 지명도 적지 않은 고로, 전체 구도를 조망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의미심장한 그림이 떠올랐다. 제3세계의 인민사를 표방하고 있는 <갈색의 세계사>조차도 유럽발 지리 구획의 유산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제3세계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라는 근사한 언명에서 시작하고 있음에도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지정학적 구도가 짙게 투영되어 있었다. 과연 프리샤드는 인도, 대영 제국의 식민지 출신이다. 탓인지 그가 파악하는 제3세계의 판도 또한 대영 제국만큼 드넓은 만큼이나 치명적인 부재가 도드라진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갈색 나라, 중국이 희미한 것이다.
중국의 부재는 취사선택일 수 있다. 혹은 언어적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치중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략이 결정적인 것은 비단 그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제3세계론 자체의 사상적 갱신에 중국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전히 미국을 제1세계, 소련을 제2세계, 나머지를 제3세계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 자체를 타파하며 제출된 중국발 제3세계론이 바로 '삼개세계론'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공히 제1세계임을 적확하게 지목했던 것이다.
양국의 적대적 공존으로 동맹국과 위성국인 제2세계를 통제하고, 그 외부의 제3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빛나는 인식론의 개진이었다. 삼개세계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냉전기의 세계를 둘 혹은 셋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계적 질서로써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간적 범위에서 유럽 식민주의의 그림자가 물씬하다면, 시간적 단위 또한 1910년대에서 1990년대로 한정되어 있음이 적잖이 아쉽다. '단기 20세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 21세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1979년의 의미가 간과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이,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해이다.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서 공히 20세기형 좌/우와 일선을 긋는 개혁과 혁명의 흐름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이다.
하지만 프리샤드가 보기에는 전자는 자본주의로의 투항에, 후자는 근본주의로의 후퇴로 접수되기 십상이다. 그러면서 정작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차 영미권의 변화, 즉 신자유주의의 약진이다. 라틴아메리카부터 동아시아까지 신자유주의가 제3세계 프로젝트를 좌초시켰음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물론 조금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 조류였던가를 판별하고 경중을 따지지 못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2010년대보다는 1990년대에 더 어울리는 독법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처럼 꼼꼼하고 폭넓게 쓰여진 제3세계의 통사가 어쩐지 작금의 동서 반전과 남북 역전의 실감과 어긋나고 있는 것은 제3세계의 '전사'가 결여되어 있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前史(전사)가 부재함으로써 後事(후사) 또한 부실하고 흐릿한 것이다. 넓은 반면으로 깊지는 못하다.
그래서 <갈색의 세계사>만으로는 제3세계의 장래를 헤아리는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인도 출신의 지식인, 판카지 미슈라가 쓴 <제국의 폐허에서>(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펴냄)를 함께 읽기를 권하는 까닭이다. 그래야 지난 200여년을 通觀(통관)하는 깊이까지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
중흥 : <제국의 폐허에서>

▲ <제국의 폐허에서>(판카지 미슈라 지음,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펴냄). ⓒ책과함께
<제국의 폐허에서>는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에서 출발한다. 20세기보다는 19세기를 획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유럽의 제국주의나 제3세계의 식민화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음이 돋보인다. 이 사건이 균열을 일으킨 핵심 사태로 이슬람의 우주적 질서의 동요를 꼽고 있는 것이다. 동아프리카부터 서태평양까지 드넓게 펼쳐져 있던 무슬림 공동체의 역사적, 문명적 공속감 및 도덕적, 정신적 일체감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신(God)은 유럽에 앞서 이슬람세계에서 먼저 죽었다. 곧이어 중화세계의 하늘(天)도 무너졌다.
<제국의 폐허에서>가 방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무굴제국, 대청제국, 오스만제국이 차례로 스러져갔다. 동시에 문명을 재건하려는 움직임 또한 비롯하였다. 즉 <갈색의 세계사>가 1914년 1차 세계 대전(민족주의)과 1917년 러시아 혁명(사회주의) 등 동/서구의 동향으로부터 제3세계를 사유하기 시작한다면, <제국의 폐허에서>는 동서고금이 착종하던 세기의 전환기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공간을 '다른 백년'과 '새 천년'의 사상적 요람이자 정치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별성을 갖는다.
미슈라가 호명하는 인물은 크게 셋이다. 량치차오와 타고르가 비교적 익숙하다면, 가장 낯선 이로는 자말 알딘 알아프가니가 있다. 이슬람 혁명의 지적 대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일생을 이슬람의 갱신과 경장을 위해 헌신하며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방랑하고 주유했던 풍운아였다.
그러면서 알아프가니는 <코란>을 명확하고 적확하게 그리고 근대적으로 읽는 학습 운동을 전개했다. '이슬람 세계의 루터'가 되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그의 포부였던 것이다. 하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투신한 '혁명파'도 아니었고, 근본주의를 고수한 '수구파'도 아니었다. 이슬람의 근대화, 즉 '이슬람의 改新(개신)교'를 도모한 이슬람 판 '고금합작'의 원조라고 하겠다.
타고르와 량치차오도 엇비슷하다. 힌두교와 유교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하여 주체적인 개화, 독자적인 근대화를 모색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생과 세상의 때가 맞지 않았음이다. 천시가 어긋났던 것이다. 당대의 신청년들은 타고르를, 량치차오를, 알아프가니를 경멸적으로 무시했다. 고리타분한 구세대로 타박하며, '보수파'의 낙인을 남발했다.
량치차오가 눈을 감은 것은 1929년이다. 타고르는 1941년 세상을 떴다. 그리고 타고르가 '동양의 남학생들'이라고 꼬집었던 좌/우파 신청년들이 인도와 중국, 터키의 독립 이후를 이끌었다. 진보를 향한 동/서구의 열의를 고스란히 복제한 아류들이 새 국가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제3세계 프로젝트가 좌초하고만 근본적 까닭 또한 여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도 진보를 섬기는 근대의 발정난 수컷이었다는 점에서 오십 보 백 보였다. 결국 따라 하기, 흉내 내기에 그쳤던 것이다. 고쳐나기, 거듭나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서구의 민주란 부자가 빈자에게 강제로 먹이는 아편"이라는 타고르의 번뜩이는 통찰을 곱씹어 볼만한 여유와 여력이 없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시간과의 경쟁'에 급급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살아야 했던 역사의 구속, 천시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천시 또한 역사의 주체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한 책은 '진보파'의 '혁명'을 추억하고, 다른 한 책은 '보수파'의 '중흥'을 복권시키려 한다. 두 권을 겹쳐 읽노라니 양자가 분열하여 신/구를 다투었던 20세기가 야속하고 비통하다. 천만다행인 것은 나에게 주어진 천시만은 선조와 선생과 선배들이 통과했던 저 지난한 20세기와는 판이할 듯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적 저항(혁명)과 인문학적 경장(중흥)이 합류할 수 있는 새 판이 열리고 있다. 그 딴 판을 직접 목도하고자 견문에 나섰던 것이기도 하다.
기왕지사 서평으로 우회한 김에,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 <제국의 폐허에서>는 량치차오에 견주어 그의 스승 캉유웨이가 상대적으로 가려졌다. 그런데 나는 갈수록 캉유웨이에 더 끌리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동서>에 남다른 애착이 간다. 變法自强(변법자강) 운동이 좌절하고 망명지를 전전하며 집필했던 동방형 유토피아 서적이다.
大亂(대란)에 직면하여 大同(대동)을 염원했던 동방지사의 집념이 집약되어 있는 각별한 서물인 것이다. 후학이자 후세로써 기리고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애틋하다. 부국강병의 논리가 판을 쳤던 난세에도 면면했던 '대동 세계'의 여망부터 추수한다. 그 연후에 두 달여간 진행된 서역 견문과 소회를 본격적으로 풀어내기로 한다. 다른 세상, 별 세계, 신천지를 보고 왔다.
[유라시아 견문] 大同(대동) : 거룩한 계보
2대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놈"
<대동서>
캉유웨이(康有爲)는 이름부터 특별하다. 생략된 말은 '聖人(성인)'이다. '有聖人爲', '성인의 뜻대로 행하리라', '성인 말씀을 따르리라'라는 뜻을 이름에 새겼다. 언제부터 사용했는가는 설이 분분하다. 유학을 공부했던 소년기와 서학을 학습했던 청년기 이후라고 짐작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당대 현실의 개혁을 위해 일생을 투신하겠노라는 출사표로써 스스로 이름을 고쳐 세상에 나온 것이다.
改名(개명)의 결기에도 改革(개혁)은 호락하지 않았다. 그가 주모했던 변법은 100일 천하로 주저앉았다. 복권된 수구파들은 반역자의 목을 원했고, 홍콩과 일본, 캐나다, 영국, 인도를 전전하는 망명자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집필한 서적이 바로 <大同書>이다.
1902년 인도에서 완성했다. 소싯적부터 특출한 천재였다지만, 이 책만은 一筆揮之(일필휘지)가 아니었다. 초고의 바탕이 된 <人類公理(인류공리)>를 발간한 것이 1884년이다. 보태고 고치고 다듬기를 거듭해 1902년이 되어서야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장장 18년이니, 집중보다는 집념의 소산이라 해야 옳겠다.
그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양무운동, 청불 전쟁, 청일 전쟁, 무술변법 등 격동의 중국 근대사가 아른거린다. 서문서부터 "국난을 슬퍼하고, 민생에 애통하여, 대동서를 지어 100년을 기리고자 할지라"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100년의 대란을 예감하고, 다른 100년을 예비하는 예언서인 듯도 읽힌다.
열쇳말은 역시 '대동'이다. 문헌의 기원은 <禮記(예기)>로 거스른다. 예운(禮運) 편에서 天下爲公(천하위공)과 世界大同(세계대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 '大道(대도)'가 실현된 사회가 '大同'이며, 대동이 구현된 시대가 大同世(대동세)이다. 고대의 대동은 군자 또는 현자가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인간의 도덕을 밝히고 공공선을 진작시킴으로써 대동 세계를 만들어야 했다.
근대의 대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도와 덕을 근간으로 한 동방형 유토피아를 지향했다. 다만 군자와 현자에게만 맡길 수가 없음이 '變法(변법)'의 요체라고 하겠다. 만인의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이 自强(자강)의 과제가 된 것이다.
캉유웨이 또한 교육을 으뜸으로 삼았다. 人本院(인본원)부터 소학원, 중학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교육 체계를 제시했다. 小學과 大學에 앞서 '인본'이 자리함이 인상적이다. 이성보다는 인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萬人(만인)의 聖人(성인)화를 도모하는 '국민 교육'의 도입이다. 그의 평등 사상은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남녀, 계급, 민족, 인종의 차별을 지우고, 급기야 가정도 국가도 흐릿해지는 '대동의 세계화'를 제시했다.
캉유웨이의 대동 세계는 자본이 주권을 잠식해가는 작금의 세계화가 아니었다. 도덕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였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철도, 전신, 전기가 선사해준 기회를 높이 샀다는 점이다. 전 지구적 의사 소통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전 지구적 德治(덕치)의 구현도 가능해졌다고 생각했다. 한 마을, 한 국가, 한 지역을 넘어 비로소 전 지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하고 계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쳐 말해 서방이 전해준 物流(물류)에 동방의 文流(문류)를 실어 보낸다는 역(逆)개화의 발상이었다. 중화 문명의 정수를 길어 올려, 온 누리를 길들이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동세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公政府'(공정부) 아래 계(界)와 도(都)의 자치를 누린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 또한 20세기형 천하에 방불했다 해도 오독만은 아닐 것이다.
대동교
'대동'이 중화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이상이었듯, '대동의 근대화' 또한 중국만의 것일 리는 없었다. 대륙에 캉유웨이가 있었다면, 반도에는 박은식이 있었다. 白巖(백암)이 제창한 것이 바로 '大同敎'이다. 1909년이었다.
전후 사정이 있다. 때는 일본의 통감기였다. 병합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림들의 친일화에 매진했다. 아무리 대한제국으로 꼴을 바꾸었다 한들, 반 천 년 조선의 근간은 유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완용, 신기선 등 친일 유림들의 주도하에 대동학회(大東學會, 1907년)를 조직했다. 즉 대동학회라는 似而非(사이비)의 대항마로써 대동교가 등장했던 것이다. 1909년 9월 11일, 창립 총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장소는 응당 성균관이었다.
하필 '대동교'였을까? 박은식은 황해도 출신이다. 기독교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 북삼도에서 교세를 빠르게 확장했다. 조선 시대 성리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고, 황해와 압록강 건너 청의 선진 문물을 앞서 접했던 곳이다. 개화적 사고도 이르게 피어났다. 박은식은 소년기와 청년기를 통하여 기독교의 확산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대동교의 모델은 기독교에 가까웠다. 유림의 선교사화를 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림이 기득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민 교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909년에 발표한 그의 논설, <儒敎求新(유교구신)>에서도 위민(爲民)주의, 구세주의, 현실주의를 내세웠던 바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改新(개신)의 영감을 얻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개신유교는 개신교와 달랐다. 전지전능 유일신을 신봉하는 '미신'은 따르지 않았다. 사후 천국이나 극락을 말하지도 않았다. 구원이나 해탈보다는 경세가 우선이었다. 박은식에게 종교란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말로써 만민을 깨우치는 것이었다. 그 성인 또한 여전히 공맹이었다.
공자의 대동주의와 맹자의 민본주의에 근거하여 유교의 근대화, 유교의 인민화를 꾀했던 것이다. 즉, 조선 유교의 국가적, 권위적 성격을 지우고, 신분이 낮고 배움이 모자란 일반 대중까지도 도덕으로 교화하여 근대적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제왕의 유교에서 인민의 유교로. 그렇다면 대동교를 1894년 짓밟힌 東學(동학)의 後生(후생)이었다 해도 지나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박은식의 天時(천시)도 캉유웨이에 못지않았다. 아니 더 가혹했다. 대동교 창설 이듬해 國亡(국망)을 경험한다. 그 또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망국민의 처지로 망명한 것이니, 반역자의 운명보다 더 처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꿈을 꾸었다. 망명지 서간도에서 집필한 서적이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1911년)이다. 식민지기 종종 등장했던 몽견(夢見)류 소설의 하나였다. 나는 그의 대표작 <韓國痛史(한국통사)>(1915년)보다도 이 글을 훨씬 아끼는 편이다. 근대적 역사학자보다는 전통적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물씬하기 때문이다. 사유가 활달하고 분방하다.
<몽배금태조>는 조선의 망국민 무치생(無恥生)이 단군이 강림한 음력 10월 3일, 꿈에서 금나라 태조 아골타를 만나 조선의 망국과 독립을 주제로 나눈 가상의 대화를 서술한 작품이다. 무치생이 박은식의 작중 화자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헌데 만주로 건너가 꿈에서 만난 인물이 주몽도 대조영도 아니고 아골타였음이 의미심장하다.
상고사의 영웅주의로 내달리지 않았다. 금나라가 어떤 나라였던가. 흉노, 돌궐, 선비를 이어 북방을 제패한 여진족의 나라이다. 강성한 금나라는 송나라에 조공을 하지 않고 '조약'을 맺은 최초의 나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조선의 유교 전통을 극복하기 위한 알레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이 섬겼던 성리학, 즉 주자학이 발원한 송나라와 대등했던 금나라를 대타항으로 소환한 것이다. 조선에 자자했던 소중화의식과 화이론을 일거에 허무는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서사 전략이다.
그럼에도 친일의 독배를 들이킨 통상적 문명 개화론자들과는 달랐다. 서구화를 대세로 받아들인 통속적 계몽주의자도 아니었다. 박은식이 <몽배금태조>를 통해 인식하는 20세기란 동과 서, 신과 구의 문명 교체기이다. 다만 우열 관계로 파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계몽과 발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살벌하고 잔혹한 강권주의에 불과함을 견지했다. 그래서 오늘의 강권주의를 극복하고 내일의 대동 세계를 위하여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다.
그가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보를 섬기는 계몽서사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도리어 계몽이란 미명하에 펼쳐지고 있는 강권의 현재가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문명의 교체와 전환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고로 지금의 고난 또한 영영 하지는 않을 것이다. 不道(부도)하고 不法(불법)한 난세가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후사의 태비는 역시 교육이었다. 공자 이래 동방은 늘 '교육입국'이었다. 특히 하등 사회 자제의 교육을 강조했다. 다만 무치생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할 상류층의 다수가 매국노이거나 은둔지사라는 점이다. 금태조의 답변은 명료하다. 자신만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세상을 구제하지 않은 은둔지사는 그 죄가 매국노와 같다는 것이다.
전환기의 지식인은 공덕과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배우는 만큼(修己) 베풀어야(治人) 한다. 조선은 그 호걸의 피를 가진 열혈아가 없어서 망한 것이다. 아골타의 입을 빌어 志士(지사)와 烈士(열사)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다. 士氣(사기)의 진작이자, 자기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무치생의 꿈이 때 이르게 성취되는가 했다. 8년 후 3.1 운동이 일어났다. 박은식에게 3.1 운동은 조선 민족의 독립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패도가 왕도로 반전하는, 강권적 세계가 대동 세계로 이행하는 터닝 포인트였다. 그는 곧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달려갔다. 비로소 大同夢(대동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지를 확보한 것이다.
대동단, 대동회, 대동제
3.1 운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결성된 독립 운동 단체가 하나 있다. '조선 민족 대동단'이다. 1919년 3월 말에 발기했다.
강령이 각별하다. 1항이 "조선 영원의 독립을 완성하는 것"임은 능히 이해될 만하다. 2항은 "세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 국민에 고함>이라는 문서도 작성했다. "동양 5억의 민생이 우의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지, 의구, 원한의 악연에 고민하는 것을 명예로 하는지, 일본 국민의 일대 각성을 필요로 한다"는 호소가 간절하다.
"조선 독립의 선포가 공존공영의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추호도 역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것도 아니며, 근린을 끓고 원교를 부르려는 것도 아니"라며 일본을 달래고 어르고 있다. 즉 3.1 정신 또한 도무지 민족주의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의 화목과 세계의 화평을 함께 염원했다. 이러한 문명주의란 마땅히 유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大同團'이었다.
도둑처럼 해방이 오자, 대동은 다시 솟아났다. 대동아가 붕괴한 다음날(8월 16일), 大同會(대동회)가 결성된 것이다. 불현듯은 아니었다. 일제 치하 비밀 독서 모임이었던 大同社(대동사)가 모체였다. 대동회는 명륜학원 출신 중에서도 한학 실력이 가장 뛰어났던 수재들이 주축이 된 청년 유림 단체였다. 캉유웨이를 읽고, 박은식을 읽었던 지하조직이 해방 공간의 정치 단체로 등장한 것이다. 유교계의 재건과 통합은 물론이요, 독립 국가 건설이라는 시무에도 적극 기여코자 했다. 은둔지사를 털어내고 사대부의 이념형을 복구한 것이다.
1946년 '민족대동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치 결사체의 성격은 더욱 또렷해졌다. 독립 운동 세력들의 대동 단결을 꾀하며 통일 국가 수립을 추구했다. 1947년 정책 방향도 제출한다. 정부 형태로는 인민 공화국을, 토지 정책으로는 무상 분배를, 노동 정책으로는 8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 보장,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아무래도 대동 사상은 사회주의에 친화적이었던 것이다. 대동회의 좌향좌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김태준도 있었다. 한때 명륜학원 강사였던 그는 동아시아의 '해방구'였던 연안에서 마오쩌둥과 더불어 망명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온 '전설'이었다. 청년 유림들에게 그의 아우라는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공간은 급속도로 닫혀갔다. 탈식민은 미-소 주도의 신식민으로 굴절되었다. 미군정은 일찌감치 민족대동회를 온건 좌파(moderate leftist)로 분류하여 동향을 감시했다. '자유민주'를 이식하려는 미군정과는 애당초 길이 달랐다. 불화는 국대안(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파동부터 불거졌다.
성균관 복권을 통하여 '大學'의 재건을 꾀했던 대동회가 국대안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선 것이다. 분단 건국이 확실해지자 결국 상당수는 북조선을 선택했다. 남한에 잔류한 일부는 국회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었다. 한국전쟁 발발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북과 남 모두에서 대동회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로써 좌/우는 물론이요 고/금 사이서도 분단 체제가 확립되었다.
분단 체제는 해방 공간의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을 막론하고 유교계의 동향은 망각되었다. 반 천 년의 정신사가 반 백 년도 못된 식민기 동안 사그리 사라질 리 없건만, 무시하고 간과했다. 그만큼 한국사 연구와 서술의 기본 틀이 편향되고 편중되었던 것이다.
허나 좌편향도 우편향도 '올바르지 못한' 진술이다. 좌/우 공히 근대로 편향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계와 공산주의 계열을 서사의 축으로 삼은 것이다. 분단 체제의 강화로 유교계의 몰락 또한 가팔라졌다. 북에서는 봉건의 유습으로 매장되었고, 남에서는 현실과 등을 지고 칩거함으로써 박제화되었다. 갱신과 경장으로 거듭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의로움을 실천했던 반 천년 유교사의 전통은 단절되었다.
내가 몹시 흥미롭게 여기는 현상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점에서 다시 한 번 '대동'이 호명된다는 점이다. 대학 축제가 '大同祭(대동제)'로 전환되어 갔다. 1984년 고려대학교에서 비롯하여, 1987년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즉 '6월 항쟁'에 앞서 '5월 대동'이 있었다. 大同의 이상을 大學의 담장 밖으로 밀어붙인 것이 '민주화'였다. 이 무렵 대학은 민속 전통의 장마당이었다. 농악과 가면극, 풍물과 탈춤이 신록의 캠퍼스를 온통 뒤덮었다.
당사자도 아니고, 그 시대를 연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짐작하고 추론할 뿐이다. 아무래도 5월의 광주가 기폭제였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미국식 대중문화에 반성이 일었을 것이다. 반면으로 '國風(국풍) 81'과 같은 관변 주도의 전통 문화 부흥에도 반감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대동제 또한 편향이었다. 민중에 편중됨으로써 농민 공동체의 전통만을 편애했다. 정작 조선이 일구었던 고급 문명의 정수를 오늘에 되살린다는 발상에는 달하지 못했다. 중흥보다는 혁명 쪽이었다. 제3세계 프로젝트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대동제의 주역이었던 1980년대 학번은 공교롭게도 한글 전용 1세대였다. 나는 박정희의 功(공)이 7이고 過(과)는 3이라고 넉넉하게 봐주는 편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그나마 나라의 꼴이 갖추어졌다고 여긴다. 유신 체제는 무리수였지만, 1970년대의 제3세계에서 유별난 것도 아니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구조적 압력 아래서 초기 자본 축적을 위한 정치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분단국의 숙명마저 지고 있었다. 민주면 무조건 추키고, 독재면 한사코 사리는 '근대적 편견'을 사절하고 반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3의 과실 중에서도 한글 전용 정책은 치명적인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근대화'와 동떨어진 '조국 근대화'의 결정판이었다. 메이지유신을 그리도 숭상했으면서도 유독 표기법만큼은 국한문 혼용을 폐기한 것이 두고두고 안타깝다. 아마도 한글 전용을 먼저 도입한 북조선과의 민족주의 경쟁, 분단 체제가 한 몫 했을 법하다.
탓에 일천 년 한자 문명과 단절된 80년대의 열혈아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정작 '대동'의 기원과 계보에 얼마나 자각적이었을지 적잖이 회의하게 된다. 대동강이 천년을 흐르고, 대동법과 대동세로써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명 국가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이 얼마나 있었을까. 멀게는 율곡 이이에서 담헌 홍대용, 혜강 최한기를 거쳐 백암 박은식을 잇는 후예이자 적통이라는 '신진 사대부'의 기상은 있었을까. 피는 들끓었지만, '혼은 비정상'이었다.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연 민주화 이후 대동제는 시나브로 시들해졌다. 겉만 남고 실은 사라졌다. 혹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역사의 종언'에 발맞추어 뉴라이트(신진 매국노)로 전향했고, 일부는 포스트 담론으로 탈주하여 은둔지사로 돌아갔다. 대학은 다시 잦아들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갈수록 대동 세계와 멀어져갔다. 급기야 민주화 30년을 목전에 두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동세와 대동 세계
올해는 <신청년> 창간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새파란 친구들이 조롱하고 야유했던 캉유웨이의 '대동몽'이 목하 중국에서 환생하고 있음이 의미심장하다. 청두(成都) 시가 도농 일체화와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방한 구호가 바로 '대동 사회'인 것이다. 농민공의 사회 복지를 개선하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에 '대동'의 이름을 붙였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 시대의 국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교의 근대화, 유학(古)과 사회주의(今)의 결합이라는 '유교 좌파'의 전통이 갈수록 역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명으로 삼고 있는 저 나라가 '자유민주'를 복제할 가능성은 터럭만큼도 없다 해도,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은 크게 틀리지 않을 성싶다.
중국만큼이나 대동의 계보가 면면했던 조선 또한 '자유민주'를 추구한 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뭐래도 분단의 소산이다. 분단 건국과 분단 체제로 말미암아 이식된 것이다.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다. 애당초 토양이 달랐다. 역사의 축적이 없는 외래종이 튼튼하게 자리 잡힐 리가 없다. 그 부정교합의 주동자가 이승만이었다. 새삼 박은식과 이승만의 갈림길을 복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분수령은 역시나 1894 갑오년, 청일전쟁이었다.
소싯적 두 사람은 모두 위정척사론자였다. 그러나 노대국 청국이 신흥국 일본에 무참히 패하는 것을 보고 개화 사상을 수용했다. 다만 방향이 달랐다. 배재학당에 들어간 이승만은 서양의 정치 사상을 공부하고 서구론자가 되어갔다. 박은식은 한역 신서를 탐독하고 번역하면서 개신유림으로 변해갔다.
대한제국기 이승만은 개신교를 받아들여 '개신교 입국론'을 정립했고, 박은식은 양명학에 입각한 '유교구신론'을 주창했다. 경술국치, 이승만과 박은식은 미국과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떠났고, 박은식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들어가 대종교 시교사 윤세복에게 신세를 졌다.
이승만은 하와이를 주 무대로 교육, 종교, 언론, 단체 활동을 펼치며 유력한 독립운동가로 성장했고, 박은식은 노령, 만주 및 중국 관내를 넘나들며 언론, 출판 및 단체 활동을 벌이며 독립지사로서 명성을 다져갔다. 이처럼 해양과 대륙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합류하게 된 계기가 3.1 운동이다. 물과 뭍이 만나는 上海(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다. 이승만이 상하이에 머물렀던 1920년 12월부터 1921년 5월까지 두 사람은 직접 대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조우는 아름답지 못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론에 박은식은 대노했다.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마저 미리 팔아먹은 것이니, 이완용보다 더한 놈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1대 임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탄핵한다. 그리고 2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이 박은식이었다. 인연보다는 악연이었다.
그러나 천시는 이승만 편이었다. 역사는 임시 정부에서 탄핵받은 이승만을 복권시켰다. 미국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 식민기의 위임 통치가 해방기의 신탁 통치를 거쳐 분단기의 한미 동맹으로 결착이 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또한 '의존적 독립국', 근대적인 속국이 되었다. 과연 동맹국의 형식을 정초한 그는 '건국의 아버지'였다. 조공국-식민지-동맹국으로 이어지는 속국의 계보를 완성한 것이다.
캉유웨이는 <대동서>에서 거란세(據亂世), 승평세(升平世), 대동세라는 삼분론을 제시했다. 난세와 치세 사이에 승평세를 놓은 것이다. 곰곰 아귀를 맞추어 본다. 아편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를 동아시아 100년의 거란세였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하면 지금은 승평세의 와중인 것일까. 작금 반도와 열도의 반동적 작태 또한 거란세의 말기 현상일 뿐이라고 낙관해도 되는 것일까. 불안과 불길을 떨쳐내기 위해 나는 다시 백암을 펼친다.
"천도는 순환하기를 좋아하고, 만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되돌아가며,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구하지 않으니, 이는 모두 불변의 이치이다. 어찌 인인(仁人)과 지사(志士)가 이 어지러운 적자생존의 세태를 구하려 함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세계 대동과 인류 공존을 위하는 사상이 점차 학자들의 이론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天道(천도)는 순환할 것이며, 만물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어느 것도 장구하지는 않은 법이니, 서세동점과 우승열패의 근대 또한 불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변함없는 이치에서 작은 위안을 얻는다. 또 대동세와 대동 세계를 구하는 이론의 등장에도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싶다는 소망도 키운다. 아무렴 박은식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다. 그가 나고 자란 세계와 세기가 모질었던 것이다.
世紀는 바뀌었고, 世界도 달라졌다. '대동몽'을 안고서 향하는 곳은 중국의 서편, 西域(서역)이다. 태평양의 亂流(난류)와는 사뭇 다른 승평세의 活氣(활기)가 일고 生氣(생기)가 도는 '다른 백년'의 현장이었다.
[유라시아 견문] 前世今生(전세금생) : 장안과 시안
"시진핑의 꿈은 '대당제국'의 부활"
관중(關中)
중국에 처음 간 것이 2004년이다. 나름 20대 중반의 결단이었다. 뜻을 두었던 西學(서학)에서 답을 구하지 못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불어와 독어를 연마했지만, 이 땅의 현실과 겉돌고 있다는 회의가 짙었다. 내 말과 글이 갈수록 공허했다. 그렇다고 한국학 또한 마땅치 않았다. 서학이 뜬구름이었다면, 國學(국학)은 외통수였다. 답답하고, 갑갑했다. 한쪽은 남 것만 추키고, 다른 쪽은 제 것만 아꼈다. 돌파구는 동아시아였다. 중국을 左(좌)로, 일본을 右(우)로 삼아 공부를 재개했다. 東學(동학)의 출발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렸다. 2004년이면 개혁 개방 하고도 25년, 한중 수교 하고도 1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다. 하건만 사회주의의 흔적을 찾아 다녔다. 자금성에서도 만리장성에서도 혁명을 회감했다. 제 눈의 안경이었고, 아는 만큼만 보였다. 어지간히도 '좌편향'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국을 오고 갔다. 자료를 찾느라 도서관에서 죽치기도 하고, 학술회의에 참여하거나, 답사를 겸한 여행도 있었다. 자연스레 초기의 '좌편향'은 수정되었다. 도무지 좌/우로는 가늠되지 않는 나라였다. 그런데 부지불식 또 다른 편향이 있었다. 처음 간 곳은 베이징이었고, 오래 머물었던 곳은 상하이였다.
칭다오와 광저우, 난징과 항저우, 톈진과 선전도 살펴봤다. 대륙 밖으로는 대만(타이완)과 홍콩도 들락거렸다. 하나같이 바다를 근처한 동남부의 연안 도시들이다. 즉 '좌편향'을 교정하는 와중에서도 '동남부 편향'이 역력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어디까지나 '동아시아'로만 접근했다. 한자 중심, 유교 중심, 농경 중심, 강남 중심, 한족 중심, 운하 중심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통으로 '근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은연중 근대의 해양 중심 사관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겉만 핥았던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서역 행은 2003년에 못지않은 획기였다. 동남부에 치우친 편향을 거두고 마침내 서북부 내륙 깊숙이 진입한다. 교두보는 시안(西安)이다. 옛날 옛적 서역(西域)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시안으로 가는 비행기, 지도를 펼치니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복판이다. 중원과 서역, 북방과 남방, 동남부와 서북부를 가름하는 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과연 이곳은 왕년에 '關中(관중)'이라 불리던 곳이다. 최초의 중화 제국 진나라가 일어났고, 최대의 중화 제국 당나라가 번성했던 곳이다. 삼국지를 비롯한 고대사의 주요 무대로서, 시안을 수도로 삼았던 왕조만 열을 헤아린다. 그 중 셋이 (전)한과 수, 당이었으니, 명실상부 천년사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 유명한 병마총부터 두보와 이백의 시를 비롯하여 양귀비의 전설까지, 가히 중국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한편으로 이제야 이곳을 찾는 것 또한 나름의 필연이라고 여긴다. 天時(천시)가 운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옛 길을 되살리겠다는 回心(회심)의 프로젝트, '一帶一路(일대일로)'와 직결된다. 중원의 대운하와 서역의 비단길이 합류하던 곳이 바로 시안이었다. 그 첫 안내자로 장홍(张鸿)을 만났다. 시안 우전(邮电) 대학교 경영학 원장인 그는 일대일로 중에서도 一帶, 즉 내륙부를 담당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발전연구원의 학술위원이기도 하다.
시안의 봄

▲장홍 시안 우전(邮电) 대학교 경영학 원장.
이병한 : 시안은 지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천만이 훨씬 넘더군요. 이미 서울보다 큰 도시이고, 머지않아 경제적으로도 도쿄를 추월하겠구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영향이 클 텐데요. 공항부터 시내까지 선전 구호가 요란하더군요.
장홍 : 시안은 지난해 9.9%의 성장을 기록했어요. 충칭에 이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발전 전략이 전환하면서 내륙 도시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단연 서부에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시안의 전략적 위치와 그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시안의 활력과 실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건국 이래 가장 좋은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기회를 잘 포착하여 국제 교통, 국제 무역, 국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성취를 일구어야 합니다. 서북 5성의 중심 도시일 뿐 아니라 유라시아 합작을 선도하는 내륙의 거점 도시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병한 : 동남부 연안부의 대도시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장홍 : 시안은 지리적으로 중국 강역(疆域) 지리의 중심입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시안을 중심으로 고대 상업 활동이 천 년간 지속되었지요. 이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유산이 시안의 영광이자 미래 동력입니다. 시안이 내륙형 개혁개방의 근거지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병한 : '내륙형 개혁 개방'이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기존의 개혁 개방과는 어떤 점이 다를지요? 일각에서는 동남부의 과잉 생산 거품을 서북부와 중앙아시아로 이전시키는 임기 응변책에 불과하다며 폄하하기도 합니다.
장홍 : 그동안 시안에는 항구가 없어서 발전이 더뎠습니다. 해안과 1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로를 통하여 시안을 '국제 육항(陸港)'으로 육성하기로 했어요. 철도와 도로, 항공을 종횡으로 엮어서 '내륙 항구'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성내에만 5000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향후 5년 동안 1500킬로미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철도는 3500킬로미터가 더 증설되지요. 시안 역은 명실상부 신 실크로드의 허브 역이 될 것입니다. '장안(長安)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안에서 출발하는 이 열차는 우루무치를 지나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로테르담에 닿습니다. 11일 여정으로 동부 항만에 비해 열흘을 단축합니다. 현재 1주일에 3차례 운행 중이며 산시 성의 화물들을 중앙유라시아로 운송하고 있어요.
이병한 : 열차의 이름이 상징적이네요. 대당제국의 수도, 장안에서 따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원과 서역을 잇는 거점이겠지만, 저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작업 같기도 하네요. '시안의 미래가 장안'이라니, 고대-중세-근대라는 진보사관을 허무는 '타임머신'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변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하늘길도 분주하던데요. 신공항 건설이 한참이지요?
장홍 : 시안공항은 이미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다졌습니다. 24개 해외 항공사가 시안으로 직통하고 있어요. 인천-시안 간 직항로도 이미 운행 중이죠? 올해는 몰디브와 도쿄도 직항이 생겼습니다. 곧 알마티와 로마도 직항로가 생기고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이병한 : 시안의 직항로를 살피니 역시나 중앙유라시아 국가의 수도들이 많더군요.
장홍 : 산시 성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과 자매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대사관은 베이징에 있지만, 별도로 영사관을 시안에 두고 있어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의 영사관도 생겼습니다.
이병한 : 삼성전자도 시안에 큰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한국 영사관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의 풍향에 따라 '서진'하고 있는 셈이죠. 왕년의 신라방을 떠올리게 됩니다.
장홍 :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 동부에서 내륙으로 산업 단지가 대거 이전하면서 시안이 최대 물류 센터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시안을 비롯한 서부 진출이 활발합니다. 뤼띠(綠地)에 이미 한인촌이 형성되었어요.

▲ 실크로드의 기점, 화하 문명의 기원. ⓒ이병한

▲ 실크로드 건설 신기점, 문명 도시 창건. ⓒ이병한
이병한 : 지난 9월에는 '유라시아 경제 포럼'이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장홍 : 올해는 40여 개 국에서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기간 산업, 농업, 에너지 산업 등에서 지난 2년간 체결한 프로젝트만 100개가 넘어요. 러시아와 합작하여 하이테크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중앙유라시아 국가들과는 에너지 산업, 생명과학, 정보 산업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일의 신기술 농업 단지도 있지요. 건조 지대에서의 농업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유라시아와 남아시아의 학생들이 시안의 주요대학으로 유학 오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병한 : 저도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동부의 명문 대학들보다도 인종적 구성이 더 다양해 보이더군요. 연안의 개혁 개방이 '중국이 세계로'였다면, 내륙의 개혁 개방은 '세계가 중국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중국이 현대 세계로'에서, '미래 세계가 고대 중국으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올해가 '실크로드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실크로드 박람회, 실크로드 예술제, 실크로드 영화제 등 관련 행사가 다양하더군요.
장홍 : 산시 성과 시안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실크로드 도시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대일로 여행지 연맹'도 시안에서 창립 대회를 가졌어요. 여행사, 항공사, 요식업, 숙박업계는 물론 IT 업체와 광고 회사까지 광범위한 연합체를 꾸린 것입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수많은 국가와 도시들의 독특하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협력하는 초국적 민간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병한 : 21세기의 물류에서 디지털과 온라인을 빠뜨릴 수 없을 텐데요. 알리바바도 시안에 진출했다지요?
장홍 : 지난 8월에 알리바바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4G 보급과 온라인 상업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어요. 이미 시골 농부들이 온라인으로 작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한 직거래이죠. 기존의 슈퍼보다 절반이나 저렴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실습 과제로 농민들을 지원했어요. 학생들은 스타트업을 체험하고, 농부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은 더 싸고 신선한 농작물을 구입하는 윈-윈(win-win)이지요. 그 덕에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도 시안과 산시 성입니다.
이병한 : 도농 간 온라인 연결망이네요. 더불어 저는 알리바바가 아랍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을 눈 여겨 봤습니다. 중국 시장을 석권한 알리바바가 이슬람 세계로까지 진출하는 형세인데요. 아무래도 무슬림들에게는 '아마존'보다야 '알리바바'가 더 친근하지 않겠어요? 시안, 아니 장안과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장안이야말로 서역풍이 농후했으니까요.
장홍 : 저는 일대일로를 일컬어 종종 前世今生(전세금생)이라고 표현합니다.

▲ 중국 시안. ⓒ이병한
장안의 봄
시안의 前世(전세), 장안은 화려했다. 7~10세기, 세계의 수도였다.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했다. 학문의 메카였다.
동아시아에서 학생들과 승려들이 몰려왔다. 예술의 맨해튼이었다. 오아시스 왕국들에서 화가와 음악가들이 몰려들었다. 경제의 중심이었다. 사마르칸트,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아랍에서 상인들이 밀려왔다. 종교의 천국이었다. 불교와 이슬람교, 동방기독교까지 번성했다. 기회의 땅이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망명객부터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벗어나려는 이민자들까지 죄다 빨아들였다. '대당몽(大唐夢)'으로 합류한 인구는 무려 100만을 넘어섰다.
덩치만 컸던 것이 아니다. 속도 꽉 찼다.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쿨하며 힙한 곳이었다. '장안의 화제'가 곧 글로벌 트렌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류(胡流)'가 열풍이었다. '이란 스타일'이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댄스는 호선무(胡旋舞)가 으뜸이었고, 미인은 호희(胡姬)를 제일로 쳤다. 먹고 마시는 호식(胡食)도 유행했다.
페르시아 출신 셰프가 와인에 올리브를 곁들인 만찬을 제공했다. 당대의 스타 가객 이백은 푸른 눈에 곱슬머리, 하얀 피부를 가진 호희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기분을 즐겨 노래했다. 패션 역시 호풍(胡風)이 대세였다. 의상과 모자, 신발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했다. 또 다른 풍류가 백낙천은 '최신 메이크업(時世妝)'라는 유행시를 지어 호류에 동참했다. 고로 장안은 '漢人(한인)'들이 주도하는 '중화 도시'가 아니었다. 이국적이고, 혼종적이며, 잡종적인 세계 도시였다. 장안에 모여 사는 '唐人(당인)'들은 세계 시민의 원조였고, 유라시아의 사방으로 열린 대당제국은 세계제국의 원형이었다.
그 성세 앞에 난세가 자리했다. 5호16국 시대가 있었다. 135년간 이어진 분열과 분단의 시대이다. 암흑기만은 아니었다. 성세를 예비하는 준비기였다. 오랑캐가 중원으로 대거 남하했다. 華(화)와 夷(이), 漢(한)과 胡(호)가 뒤섞였다. 양자가 공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 창발적 변화는 역시 주변에서 비롯되었다. 선비 탁발 씨가 창업한 북위가 화이공존, 호한통합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랑캐의 두목이 자세를 고쳐 잡고 '중화 군주'를 자임했다. 대동의 이상이 담긴 균전제도 앞서 실시했다. 그래서 북방의 한족들을 감화시켰다. '호한융합체제'로 중국 재통일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장차 수당으로 이어지는 치세의 토대였다. 실제로 수와 당은 북위를 계승한 호족과 한족의 혼혈 왕조, 잡종 왕조였다. 굳이 경중을 따지면 호족의 피가 더 진했다. 그래서 유연하고 개방적이었다. 북방 유목민의 후예들이었다.
진한과 수당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춘추전국을 평정한 진한은 중원의 대일통을 완수했다. 5호16국의 난세를 극복한 수당은 중원과 서역을 통일시키는 대업을 이루었다. 인류사 최초로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을 융합하고 통합한 것이다. 그래서 진한이 다민족 제국이었다면, 수당제국은 다문명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 제국과 유목 제국을 결합시킨 복합 제국, 유라시아제국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당태종은 한인들의 천자이자 호인들의 '가한(칸)'이라는 의미에서 '천가한'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그간 시진핑 시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델을 두고 설이 분분했다. 집권 3년차, 이제는 판별이 났다. 대당제국임에 틀림없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명명백백 '盛唐(성당)'을 참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편 전쟁 이래 '서구의 충격(Western Impact)' 또한 5호16국 시대의 '북방의 충격(Northern Impact)'에 견줄 수 있을까. 유럽 열강과 러시아/소련,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여 중국을 瓜分(과분)했다. 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각종 외래 사상이 전파되었다. 아편 전쟁부터 개혁 개방까지 얼추 140년을 헤아린다. 중국공산당도 대장정의 천신만고 끝에 서북의 오지, 연안에서 토지 개혁(균전제)을 시작했다. 과연 대당제국이 이루었던 호/한 문명 융합에 견줄만한 동/서 문명 융합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중화'와 '인민공화국'의 결합, '중국(古)'과 '공산당(今)'을 결합시킨 현 지배 집단을 현대판 '천가한'이라 빗대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인가.

▲ 대당제국 재연 행사. ⓒ이병한
시안 관광의 축은 크게 셋이다. 城(성)과 市(시), 그리고 塔(탑)이다. 중국은 여전히 도시를 '城市'라고 부른다. 성벽과 시장이 옛 도시의 핵이었다. 성벽부터 오르기로 했다. 자전거를 빌려 달릴 수 있을 만큼 폭도 굉장한데 길이 또한 대단하다. 페달을 굴리고 또 굴려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 성장 역시 원본이 아니라고 한다. 명나라 때 재건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대당제국 시절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안성의 실제 규모가 현재의 시안성보다 10배는 더 컸다는 말이다. 천 년 후 대청제국의 북경성보다 1.5배가 컸으며, 동시대의 비잔틴보다는 7배, 바그다드보다는 6배가 더 컸다. 대당제국의 압도적 스케일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저녁에는 서쪽 시장, 서시(西市)에 들렸다. 야시장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실은 장안 시절부터 유명했다. 서역의 이방인들이 머물고 장사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회족(回族)들이 터줏대감이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한족들이 그들의 먼 조상이 '호식'으로 소개했을 양꼬치를 팔고 있다. 고기점이 유독 크고 두툼하며 향신료도 듬뿍 친다. 서역이 전수해준 양꼬치에 서구가 전해준 칭타오 맥주를 곁들였다. 동서고금이 어울려진 일품 야식에 시안의 떠들썩한 밤이 깊어간다.
저 멀리로 그믐달이 투명하게 빛났다. 두보가 유독 사랑했던 바로 그 달빛이다. 그는 매일같이 달의 변화를 기록하고 찬미하는 시를 짓고 읊었다. 그 달 아래로 대안(大安)탑이 눈에 든다. 21세기 시안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안의 유일한 유적이 대안탑이다. 자은사(慈恩寺)탑이라고도 한다. 당 고종이 모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불탑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효심보다 더 유명한 것은 승려의 불심이다. 이 사찰의 주지가 바로 현장 법사였던 것이다. 천축(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했던 사찰이 바로 자은사였다. 그 현장이 서역으로 가기 전에 들렸던 곳도 서시였다. 서쪽 장판에 살고 있는 서역인들에게 지도를 구하고 여행 정보를 얻었다.
2015년 가을밤, 시안성도 서시도 대안탑도 중국 도처와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흡사 '당인들의 저잣거리(唐人街)'가 재림한 듯 보였다. 그들의 면면을 찬찬히 살펴보노라니, '시안의 미래는 장안이다'라는 말이 갈수록 실감을 더한다. 中國人(중국인)과 外國人(외국인)이 반반이고, 중국인은 한족과 호족(소수민족)이 반반이다. 옛마을, 구도시, 올드타운이 점차 기운을 되찾아 가고 있다. 새마을, 신도시, 뉴타운이 독주하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신세계는 기울어지고, 구세계는 다시 차오른다. '장안의 봄'이 '시안의 봄'으로 還生(환생)한다. 關中(관중)이 부활한다.
현장은 불멸의 고전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현장을 삼장법사로 탈바꿈시킨 기막힌 SF소설이 <서유기>이다. 기차간에서 <서역기>와 <서유기>를 번갈아 읽으며 향한 곳은 투루판이다. 천축으로 가는 관문이자, 손오공의 화염산(火焰山)이 이글거리는 황막한 벌판이다. 중국의 속 더 깊숙이, 더 오래된 古城(고성)으로 들어간다.

▲ 대안탑과 현장법사.
[유라시아 견문] 서유기 : 구도와 득도의 길
왜 할리우드는 손오공을 소환하지 못할까?
신서유기
나영석 PD를 잘 몰랐다. <무한도전>을 편애했기에 <1박2일>에는 정을 주지 않았다. <꽃보다~>시리즈나 <삼시세끼>는 더 낯설었다. 외국에 머물며 국내 예능까지 챙겨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일시에 관심이 꽂혔다. 그가 <신서유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한참 서유기에 빠져있던 무렵이었다.
무릎을 쳤다. 지금 이 시점에 시안으로 가서 예능을 만든다? 그것도 TV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으로? 최신 미디어에 동방 고전의 모티프를 얹어서 새 콘텐츠를 생산한다! 나 PD가 一帶(일대)니 一路(일로)니, 유라시아의 지각 변동을 고려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때가 맞았다. 그래서 더 신통했다. 숙소에서, 카페에서 <신서유기>를 몰아서 보았다. 21세기 서역행이 선사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과연 온라인(On-Line)은 새천년의 신대륙, 신천지였다.
하더라도 영판 새 현상만은 아니다. <서유기>의 변주와 차용은 그 자체로 오래된 전통이다. 20세기에도 줄곧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추어 재탄생하고 재인용되었다. 만화로는 토리야마 아키라(鳥山明)의 <드래건 볼>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1984년 <주간소년점프>에 연재를 시작하여, 장장 10년을 지속한 대작이다.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후지TV의 만화영화로도 제작되었고, 극장판 애니메이션까지 선보였다. 태평양 건너 할리우드에서는 실사 영화로도 만들었다.
국내에선 허영만의 만화 <미스터 손>(1989년)이 먼저 떠오른다.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되어 40%대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날아라 슈퍼보드>(1990년)의 원작이다. 손오공의 여의봉은 쌍절곤으로, 저팔계의 삼지창은 바주카포로 변형되었다. 사오정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 한국적인 캐릭터로 분신하여 명랑 만화의 성격을 가미했다.
<마법 천자문>도 빠트릴 수 없겠다. 이 어린이용 한자 교재 또한 손오공을 캐릭터로 활용하여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서 입지를 굳혔다. <서유기>를 차용한 게임 또한 적지 않으니 가히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대표 격이라 할만하다. 견줄 만한 또 다른 고전으로는 <삼국지>가 유일하지 싶다.
실은 2015년, 중국에서도 신서유기가 돌풍을 일으켰다. 3D 애니메이션 <서유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뮬란>과 <쿵푸 팬더>가 세웠던 기존의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뮬란도 쿵푸 팬더도 중국의 문화유산을 할리우드에서 재치 있게 변주하여 재가공한 문화 상품이었다. 마침내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고전을 뉴미디어의 문화 콘텐츠로 재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쩐지 일대일로라는 국책의 동향과 전혀 무연해 보이지 않는다. 옛 길의 복원과 함께 고전의 현대화에도 불을 지핀 것이다. 유럽의 르네상스란 중국이 전수해준 인쇄술에 그리스 고전을 얹어 일으킨 것이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캘리포니아산 디지털 미디어에 동방의 고전을 접목시킨다. 중국이 혁명의 단계를 지나 중흥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새삼 실감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문학사의 4대 명저로 꼽히는 <서유기>조차도 실은 재활용과 재창조의 산물이었다. <서유기>는 명나라 작가, 오승은(吳承恩)의 작품이다. 명대에는 인쇄 산업이 호황을 구가했다. 농사보다 책장사가 훨씬 이문이 남았다. 출판 편집자가 신종 직종으로 각광을 받았다. 적기에 천 년 전 고전을 차용하고 재구성하여 <서유기>라는 희대의 '장르 문학'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원본과 원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서유기에 앞서 서역기가 있었다. 현장법사의 위대한 성지 순례기, <대당서역기>이다.

▲ 투루판. ⓒ이병한

▲투루판 야경. ⓒ이병한

▲ 투루판 시장. ⓒ이병한
<大唐西域記>
투루판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방에 자리한다. 사막은 내륙의 바다, 모래로 된 바다였다. 망망하고 막막하다.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 때때로 폭풍도 분다. 모래 바람이 파도처럼 일어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기온마저 살인적이다. 한참 때는 80도에 육박한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수월치가 않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다녔다. 상인들이었고, 교인들이었다. 유라시아의 물질과 정신의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자였다. 두 발로 모래바다에 비단길을 놓은 것이다. 중국과 이란, 인도는 그렇게 연결되었다. 그 꼭짓점에 투루판이 있었다.
투루판은 지금도 '세계 도시'이다. 골목 구석구석에서 난(Nan)을 팔고 있다. 중앙유라시아와 북인도에서 즐겨 먹는 일용식이다. 시장의 풍경도 동아시아의 장마당보다는 서아시아의 '바자르'에 가깝다. 페르시아풍 양탄자가 널려 있고, 반짝이는 보석이 박혀 있는 근사한 칼을 구할 수도 있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가게에 발만 들여도 차 한 잔을 대접한다. 환대의 문화를 몸에 익힌 유목민의 기질이 남아있다. 역사적으로도 투루판은 혼종 도시였다. 중원에서 이주한 중국인들과 사마르칸트 출신의 소그드인들이 모여 살았다.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먼저 호악을 듣고 호선무를 보았을 것이다. 소그드인 또한 이곳에서 처음 중국 문화를 접했을 것이다. 중원과 서역의 융합, '장안의 봄' 또한 이곳에서 출발했다.
현장법사도 투루판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천축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당나라는 '대당제국'에 모자랐다. 629년, 겨우 창업기였다.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형제들을 살해하고 등극한 직후였다. 일종의 쿠데타였다. 즉위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했다.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고, 그 첫 목표가 북방의 위협 돌궐(투르크)이었다.
돌궐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하기 위해서 국경에 비상령을 선포하고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현장은 그 계엄령을 어기고 여행을 감행한 것이다. 그를 이끈 것은 國法(국법)이 아니라 佛法(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장안을 몰래 빠져 나온 그는 혈혈단신 고비사막과 기련산맥(치롄산맥) 사이에 난 하서회랑을 걷고 또 걸었다.
복병은 고창(高唱)국이었다. 고창국은 투루판에 자리했던 왕국이다. 당시 국문태(麴文泰)라는 한인(漢人)이 다스리고 있었다. 국왕은 천축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남아 불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법까지 어기고 고국을 떠난 마당에 청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단식까지 불사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불법을 설파하겠다는 약조를 하고서야 여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
망외의 소득도 없지 않았다. 4명의 사미승과 법복 30벌, 황금 100량과 은전 3만과 비단 500필을 제공받은 것이다. 게다가 돌궐의 군주들에게 전달하는 소개장까지 써주었다. 당시 투루판은 페르시아 세계의 동쪽 끝에 자리한 가한(Kaghan)의 동맹국이었다. 그의 소개장이 유목세계를 통과하는 일종의 '비자'가 된 것이다.
고창을 출발한 현장은 타클라마칸 사막, 천산산맥을 가로지르고, 타슈켄트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다. 모래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관음보살'을 되뇌며 전진을 거듭했다. 천신만고 끝에 천축에 도착한 현장은 인도의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각지의 불적(佛跡)을 탐방하고 고승들을 만나 토론을 벌인다.
약관 28세의 현장이 죽음을 불사하고 천축으로 향한 이유는 크게 셋이다. 첫째는 성지 순례이다. 불타가 나고 자란 성스러운 고장을 직접 방문하고자 했다. 둘째는 유학이다. 당시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중구난방이었다. 정확하고 엄밀한 번역이 부재했다. 마땅한 스승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장에서 불학의 정초를 닦고자 했다.
무엇보다 그가 고뇌했던 철학적 난제는 '인간의 成佛(성불) 가능성'이었다. 과연 모두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만인이 불타가 될 수 있는가? 현장의 평생 화두였다. 그래서 불학의 메카였던 갠지스 강 근처 나란타 사원에서 5년을 배우고 익힌 것이다. 유학생이었지만 불심에 터한 향학열은 발군이었다. 산스크리트어를 익혀서 원전을 독파하고 암송했다. 그를 유난히 아꼈던 고승들이 나란타에 머물러 학맥을 이어주기를 청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현장은 귀국을 선택했다. 애초 돌아오기 위한 출타였다. 천축행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중생의 구제였기 때문이다.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하여 유학과 순례를 단행했던 것이다. 즉, 소승보다는 대승이었다. 홀로 아라한에 이르는 것으로는 족할 수가 없었다. 속세로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해야 했다. 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淨土(정토)로 전환시키는 변혁에 있었다. 그래서 달달 외운 불교 원전을 잔뜩 짊어지고 돌아온 것이다.
훗날 무거운 책 지게를 이고 있는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별명도 '경전상자(經笥)', 당대의 '걸어 다니는 사전(Walking Dictionary)'이었다. 귀국 후에도 방심할 틈이 없었다. 여생을 경전 번역에 헌신했다. 밤낮을 불문하고 촌음을 다투어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한자로 옮겼다. 그 전에는 한문에 능숙치 못한 서역인이 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번역 투가 심하고, 뜻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 현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대로 된 한역 불경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의 초인적인 집념으로부터 불교는 동아시아 정신 세계의 거대한 지반을 이루게 된다.
그가 돌아온 해는 645년이었다. 장장 16년의 대장정은 전대미문, 전인미답이었다. 그의 귀국 소식에 온 장안이 들썩였다.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던 당 태종마저 몸소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138개국의 생활상, 역사, 지리와 종교 등을 기록한 <대당서역기> 또한 수많은 설화와 전설을 파생시켰다. 대당제국 때 이미 <대당삼장법사취경기(大唐三藏法師取經記)>나 <대당삼장취경시화(大唐三藏取經詩話)>와 같은 민간 설화가 등장했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맥이 끊어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유기류'의 원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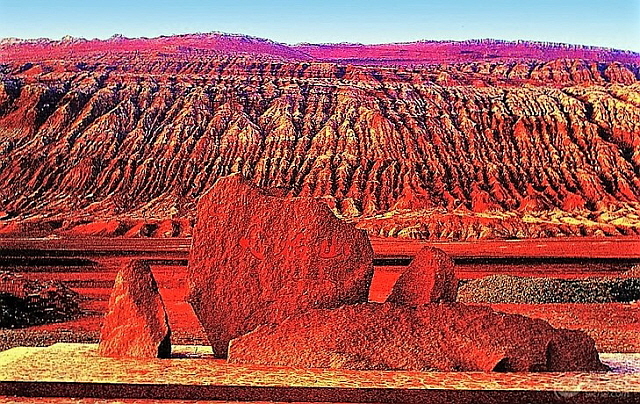
▲ 화염산. ⓒ이병한
<西遊記>
화염산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투루판과 고창 고성(古城)을 오가는 길에 길게 자리했다. 수직으로 파인 수많은 주름들로 이루어진 붉은색 산줄기가 기기하고 묘묘하다. 서역인은 '붉은 산'이라는 뜻의 '키질 탁'이라고 불렀다 한다. 너무나 밋밋한 이름이다. 중국인들이 일컬었던 화염산(火焰山)이 훨씬 제격이다. 멀리서 보노라면 정말로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느낌이다. 환상 문학이자 탐험기이며 액션물이기도 한 <서유기>의 무대로도 안성맞춤이다.
<서유기>의 주인공은 단연 손오공이다. 구미에서 <서유기>를 번역할 때 원숭이를 제목(Monkey King)으로 내세웠을 만큼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캐릭터가 살아 있다. 마력에다 마법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말썽꾸러기이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에도 원숭이 장수 하누만(Hanumn)이 있다는 것이다. 힌두교의 대서사시 <라마야나(Rmyaṇa)>에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라마를 돕는 원숭이 장수가 바로 하누만이다. 지금은 가네쉬와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었다. <서유기>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애독되었다면, <라마야나>는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라마와 삼장, 하누만과 손오공은 신기하리만큼 닮았다.
그래서 손오공과 하누만의 상관관계에 대해 학계의 설이 분분한 모양이다. 손오공이 하누만을 차용한 것인지를 따지는 게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서유기>가 <대당서역기>에 바탕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불교 설화나 인도 신화가 삽입되는 것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중국과 인도, 불교와 도교 등 지역과 시대를 넘나들어 멀티 소스를 하나의 서사로 集大成(집대성)한 작품이라고 간주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創作(창작)을 과도하게 추키는 것도 근대의 편견이다. 述而不作(술이부작)의 태도는 동방의 오래된 미덕이었다.
배경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서사의 궤적이다. <서유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손오공의 탄생과 천궁에서의 소동이 1부라면, 삼장법사의 생애를 설명하는 부분이 2부이다. 그리고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을 제자로 삼아 서역으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3부를 구성한다.
백미는 단연 3부이다. 분량 면에서도 8할을 넘는다. 고로 <서유기>는 손오공이 삼장을 만난 이후에 전개되는 성장과 성숙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손오공은 바윗돌에서 태어나 동물로 살아가다가, 수련을 통해 막강한 힘을 얻지만 정작 그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요마가 된다. 그러다 서역 여행을 통해 다른 요괴를 물리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德性(덕성)'을 몸에 익혀가는 것이다. 탁한 기운을 맑게 가꾸고, 거친 기질을 어질게 길들여간다.
성장과 성숙의 서사는 공간적 기표로도 분류된다. 서유기는 천계-지상-하계로 삼분되어 있다. 천계는 신성한 공간이다. 하계는 욕망이 들끓는 원초적 공간이다. 지상은 천계와 하계 사이의 세속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읽힌다. 하계가 무의식이라면, 지상은 의식의 세계이다. 그리고 천계는 자아를 넘어선 진아(眞我)의 여여한 경지라 할 수 있다. 즉 서유기는 그 자체로 존재의 근원으로 진입하는 求道(구도)의 여정이다. 수성(獸性)을 거두고 인성(人性)을 획득하고 신성(神性)에 이르는 得道(득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반영웅적 영웅'이다. 멀리는 헤라클래스부터 가깝게는 할리우드의 슈퍼 히어로와는 전혀 다른 영웅상을 제시한다. 압도적인 괴력으로 세상을 홀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힘을 발산하기보다는, 수행을 통하여 각성하고 덕화시킨다. 武(무)를 文(문)으로 감싸 안기, 중국의 쿵푸와 인도의 요가에 담겨있는 '아시아적 가치'가 손오공의 성장기에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고로 <서유기>는 선이 악을 이기고, 재난에 처한 세계를 영웅이 구해낸다는 천진난만한 아동물이 아니다. 몸의 통제와 마음의 절제, 도덕의 수련을 역설하는 심오한 성인물이다. 과연 인간이 불타가 될 수 있는가? 남(Being, 존재)에서 됨(Becoming, 생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현장법사의 일생의 화두가 천년 후 SF 소설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원본이, 근본이 중요한 까닭이다.

▲ 사막 고속도로. ⓒ이병한
如反掌(여반장)
근대의 여행기는 대저 선교(Mission)이다. 처음에는 天主(천주)를 전파하고, 나중에는 民主(민주)를 설파했다. 그래서 정복과 전복(Regime Change)이 일관된 서사였다. 문명화, 근대화, 민주화를 복음처럼 외웠다. 작품으로도 반영되었다. 멀리는 <로빈슨 크루소>부터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지나 <인디아나 존스>까지 흡사하다.
독립된 개인을 드높이고, 자아와 자유를 극대화한다. 자아의 극복이 아니라 자아의 실현이 서사의 축이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는 중세라는 암흑기로 가두고, 남의 과거와 현재는 야만으로 접수해갔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계몽의 빛에 터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오만과 편견이 자라났다. 이성을 맹목하고, 과학을 맹신했다. 自省(자성)이 부족했다. 무지와 아집이 맹위를 떨쳤다. 서부 개척의 대서사는 求道(구도)와 得道(득도)를 구했던 서유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소산이었다.
손오공이 이성과 계몽의 단계에 머물 때도 있었다. 그의 如意棒(여의봉)은 뜻대로, 자유자재로 늘고 준다. 구름(筋斗雲)을 비행접시처럼 타고 다니기도 한다. DNA 복제술도 탁월하다. 털을 뽑아 수많은 분신을 만들어 낸다. 생명과학과 기계공학의 총아이다. 그럼에도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아무리 빼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한계, 그 원초적인 고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성에 대한 과신, 과학에 대한 맹신, 계몽의 서사를 일거에 허무는 擊蒙(격몽)의 죽비를 내리친다. 이 통쾌하고도 의미심장한 한 판 뒤집기의 상징이 바로 如反掌(여반장)이다. 반전시대의 메타포로 삼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길에 <서역기>가 있었다. 에고(Ego)에서 참나(眞我)로 가는 길에 <서유기>가 있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길을 떠나는 까닭은 늘 道(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새천년, 신세기, 새 길을 내는 새 역사 또한 구도와 득도와 무관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王道(왕도)의 실현이 없다면 일대일로 또한 손바닥 뒤집기(如反掌), 말짱 도루묵에 불과할 것이다.
[유라시아 견문] 대장정 : 중국의 길
中공산당은 '장제스기념관', 박근혜도 '김일성기념관'?
두 개의 대장정
중국의 서부가 20세기 내내 적막했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옌안(延安)과 시안(西安), 충칭(重庚)은 각기 현대사의 핵심 현장이었다. 다만 차이는 있었다. 서역으로 가는 옛 길이 求道(구도)의 여정이었다면, 서부로의 새 길은 救國(구국)의 행군이었다. 대장정이 그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출발은 1921년 상하이였다. 태평양과 장강이 만나는 국제 도시에서 첫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장제스가 눈엣가시로 여겼다. 국공 합작을 선도했던 쑨원이 숨을 거두자 공산당 탄압으로 돌아섰다. 밀리고 밀려 끝내 옌안까지 쫓겨 간 해가 1935년이다. 국민당의 거점이었던 난징으로부터 멀찍한 곳을 찾았던 것이라고만 여겼는데, 근방에서 살피니 또 다른 이유가 짐작이 간다.
서북은 소련과 가까웠다. 북쪽의 몽골은 이미 아시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위성국이었다. 서쪽의 신장 또한 소련이 지원하는 군벌 하에 있는 '동투르키스탄'에 가까웠다. 몽골과 신장을 배후지로 삼아 와신상담을 도모하기에 제격이었던 것이다. 地理(지리)를 地利(지리)로 활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장정의 실상이란 참담한 것이었다. 최초의 8만 명 중 최후까지 살아남은 이가 7000명에 불과했다. 그들 또한 토굴 살림을 견뎌야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기에 붉은 신화로 보정되고 윤색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붉은 대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민당 또한 대피난을 면할 수 없었다. 공산당이 국민당을 피해서 떠난 것이라면, 국민당은 일본을 피해서 거점을 옮겨야 했다. 1937년 11월 25일, 난징에서 충칭으로 천도한다. 장강을 따라서 1500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으로 중화민국 정부 자체가 피신한 것이다.
상하이 전투와 난징 대학살은 치명적인 피해였다. 상하이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비견될 만큼 치열한 싸움이었다. 양국의 정예 부대가 총력전을 펼쳤다. 난징에서 벌어진 강간과 학살의 비극 또한 상하이 대전투와 무관치 않다. 지금껏 경험 못한 중국의 결사 항전에 일본군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난징은 1927년부터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근대화 프로젝트의 총본산이었다. 식민 도시 상하이와는 다른 중국적인 근대 도시를 선보이고자 했다. 베이징에 있는 천단(天壇)과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결합한 국민당 당사부터가 20세기 초의 중국몽을 상징한다. 그 난징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충칭으로 대장정을 떠난 것이다.
즉, 1937년의 충칭을 기억하는 것은 대장정에 대한 인식의 좌편향을 교정하는데 공헌한다.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에도 기여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37년 아시아에서, 더 정확히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중일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출발이었다. 그래야 유럽과 태평양에 편중된 영미 중심의 역사 기억도 바로잡을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역은 명명백백 소련과 중국이다. 유럽에서는 소련이 독일을 물리쳤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버텨냈다. 그래서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70주년이었던 올해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열었던 것이다. 둘 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오래 전쟁을 치룬 나라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이며, 가장 많은 피난민이 발생한 나라이다. 8년간 전역이 초토화되었다. 곳곳이 쑥대밭이고, 처처가 잿더미였다.
미국이 참전한 것은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이다. 중국보다 4년이나 늦다. 그 4년간 영국도 미국도 수수방관했다. 관심은 유럽이었지 아시아가 아니었다. 중국은 홀로 싸워야 했다. 그래서 진주만을 유독 강조하는 것도 편향된 기억이다. 게다가 일본은 당일 하와이로만 출격한 것이 아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태국(타이) 진주부터 시작했다. 30분 후에는 말레이 반도로 진격했고, 그 한 시간 후에 진주만 공습이 단행되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에는 싱가포르 폭격이, 한 시간 후에는 괌에도 상륙했다. 여섯 시간 후에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도 폭격했다.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로도 출전했다.
그날 히로히토 천황은 하루 종일 해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으로 전선이 전환된 것이다. 이 노선 변경에 소련+몽골과 일본+만주국이 다투었던 할힌골 전투/노모한 전쟁(1939년)이 있었음은 몽골 견문에서 다룬바 있다.
1942년 5월까지 일본은 破竹之勢(파죽지세)였다. 유례없는 속도로 제국의 판도를 넓혀갔다. 함선 하나 잃지 않고 피지와 사모아까지 점령해서 미국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연결망까지 끊어냈다. 태평양에 산재한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구미 제국주의를 몽땅 몰아낼 태세였다. 그래서 아시아의 해방을 천명하는 '대동아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하와이도 독자적인 왕국에서 미국에 복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베트남의 호치민, 버마의 아웅산,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모두 대동아의 남양 진출에 환호했다. 조선과 대만(타이완), 만주에서는 친일 문학이 쏟아져 나왔다.
친일의 기운과 대동아의 기세가 아시아를 휘감고 있을 때, 항일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이가 바로 장제스였다. 대동아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일본의 주력군은 여전히 중국에 머물러 있었다. 달리 말해 중화민국이 육박전을 벌이며 대일본 제국의 진격을 버텨내고 있었다. 일본의 선봉대가 영국령 인도까지 처내려가지 못하고 버마(미얀마)에서 멈춘 것도 국민당군의 저항 때문이다.
그 항일의 최후 보루가 충칭이었다. '자유 중국'이라는 표상 또한 군국주의 일본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충칭에서 처음 내세운 것이다. 그 '자유 중국'을 찾아서 수백만이 쓰촨 성으로 피난하고 이주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충칭으로 이전했다. 순식간에 '중화민국의 축소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 역시 충칭에 폭격을 집중시켰다. 충칭 시민들은 방공호의 공포에서 자그만 치 8년을 떨어야 했다.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의 인고의 세월이었다. 이제는 옌안만큼이나 충칭을, 아니 옌안보다 충칭을 '항일의 수도'로써 더 기려야 할지 모른다.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 충칭 시 중심가의 항일 전쟁 승리 기념비. ⓒ이병한
남북 전쟁과 중일 전쟁
장제스는 일본을 저지했지만, 정작 중국을 차지한 것은 마오쩌둥이었다. 제국일본의 패망과 중화민국의 쇠락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일어선 것이다. 즉, 중일 전쟁의 이면에 중국 내전이 내연하고 있었다. 아니, 중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국 내전의 향방이 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제국일본이 신중국 건설의 일등공신이 되는 커다란 역설이 일어난 것이다.
장기적인 지평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청제국이 무너졌다. 밖으로는 제국주의가, 안에서는 군벌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중국은 사분오열, 구분십열로 갈라졌다. 곳곳에서 지방 군벌들이 난립했고, 외세와 결탁하는 매국노도 적지 않았다. 전형적인 亂世(난세)의 혼돈이 펼쳐진 것이다. 신해 혁명 이후 중국에서 전개된 내란과 내전은 그 규모와 기간 면에서 '유럽 내전'이었던 제1차 세계 대전을 훨씬 능가한다.
중국 내전의 균열선은 西北(서북)과 東南(동남)으로 크게 갈라졌다. 사실상의 남북 전쟁이었다. 동남을 발판으로 중국 재통일의 선두에 섰던 세력이 국민당이다. 쑨원은 광둥에 거점을 두고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삼민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창업과 개국은 이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력이 절실했다. 그래서 세운 것이 황포군관학교(1923년)이다. 근대적인 군대를 확보해야 군벌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다. 장제스가 왕징웨이를 제치고 후계자가 된 것도 그가 武人(무인)이었기 때문이다. 삼민주의의 적통을 내세운 왕징웨이가 이론가라면, 장제스는 사령관이었다. 황포군관학교의 설립과 지휘를 주도함으로써 중화민국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한 것이다. 남중국을 평정한 다음에는 북중국 수복이 지상 과제가 되었다. 이른바 '北伐(북벌)'이다. 1928년 베이징(北京)을 접수하고 이름을 '북평(北平)'으로 고쳤다. 12월 31일, 장제스는 수도 난징(南京)에서 중국 재통일 완성을 선언한다.
그러나 성급한 주장이고, 과장된 언명이었다. 당장 수도를 난징으로 삼은 것부터가 북중국에서의 약세를 반영한다. 장제스는 북경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북중국 군벌들과 접견할 때는 항상 통역을 대동했다. 북중국에서는 '동북의 풍운아' 장쉐량을 비롯한 군벌들의 입김이 여전했다. 실은 남중국에서도 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쓰촨, 윈난, 광시 성 등 서남부 또한 독자성이 여실했다. 군벌주의를 일소했다기보다는 장제스 아래 재배치한 것에 불과했다. 난징의 구심력이 약해진다면 언제라도 재분열할 수 있는 미봉책에 그쳤던 것이다.
이 중국의 남북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온 세력이 일본이다. 거점은 북방의 동쪽, 만주였다. 남중국을 통일한 중화민국과 북중국의 동편을 떼어간 제국일본이 길항했다. 남경과 동경의 대결, 북벌과 남진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중일 전쟁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다. 장제스는 일본과의 전면전보다는 내전에 집중했다. 그 중에서도 공산당 토벌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부 단속부터 해야 일본과 맞설 수 있다고 여겼다. 일리가 없지 않았다. 그는 지방 군벌도 아니고, 공산당 같은 소수파도 아니었다. 도쿄를 방문한 경험도 있는 장제스는 일본의 군사력도 익히 알고 있었다. 시간을 벌어 실력부터 축적하자는 大計(대계)는 합당한 면이 없지 않았다.
以夷制夷(이이제이)는 장제스가 즐겨 구사하는 전략이었다. 만주국 건국으로 동북을 상실한 장쉐량을 서북으로 보냈다. 옌안에 터를 잡은 공산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지방 군벌을 공산당 토벌의 최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정적 제거와 군벌 약화의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다.
헌데 장쉐량이 공산당에 패하는 낭패가 일었다. 일본의 남진으로 장쉐량은 퇴로마저 차단되었다. 처음에는 진퇴양난의 출로를 북방에서 찾았다. 소련에 접근했다. 자신의 무력과 소련의 지원으로 서북에 독립 국가를 세우자고 유혹했다. 몽골(인민공화국)과 신장(동투르키스탄)과 유사한 형태의 위성국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일본의 유라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제스의 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자칫 소련에도 패착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북진을 막기 위해 중화민국을 방파제로 활용하는 책략은 미국의 북진을 염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용했던 한국 전쟁에서도 반복되었다.
장쉐량은 다시 기지를 발휘한다. 국공 합작에 기반을 둔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이라는 묘수를 낸 것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해야만 본인도 살 길이 열릴 수 있었다. 만주의 패자였던 그로서는 일본이 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아버지 장쭤린을 죽인 원수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시안 사건'이라는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개 군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후 협박하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공산당 소탕을 멈추고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항일 전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총통이 사살될 것인가, 풀려날 것인가, 2주간 전 세계의 이목이 변방의 고도, 시안에 집중되었다.
장제스가 석방된 날은 12월 25일, 성탄절이다. 국공 합작을 수용한 장제스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중국 전역이 환호했다. 항일 민족주의가 전국적으로 고취되었다. 마침내 단일대오가 형성됨으로써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중일 전쟁은 대청제국 붕괴 이후 분열을 거듭했던 중국에 단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대 중국은 남/북, 좌/우를 막론하고 抗日(항일)에 근거해 재탄생한 것이다. 중일 전쟁은 청일 전쟁과도 성격을 달리 했다. 청일 전쟁이 제국주의 대 제국주의의 전쟁이었다면, 중일 전쟁은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전쟁이었다. 현대 중국이 역사적인 도덕성을 확보하는데 중일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1945년 이후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더불어 '빅4'로 대접받는다. 전후 질서의 기틀이 된 유엔(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에도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참여할 수 있었다. 아편 전쟁 이후 100년 만의 위상 회복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장제스는 예수와 쑨원을 호명하며 국민 혁명의 역사적 과업을 마침내 완수했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그의 목소리는 옅게 떨렸다.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급했다. 공공의 적이 물러나자 국공은 재차 분열했다. 게다가 역학 구도 또한 크게 달라져 있었다. 국민당은 일본과의 총력전 속에서 약화되었다. 반면 공산당은 크게 성장했다. 대장정의 홍군은 북중국의 팔로군과 남중국의 신사군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항일 전쟁이 아니었다.
일본군과 국민당군이 싸우고 떠난 자리에 들어가 마을을 재건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농촌을 조직하는데 더 능숙했다. 그래서 중일 전쟁 동안 군사력이 소진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세를 늘려갔던 것이다. 1937년 당시 4만 명에 그쳤던 공산당원은 1945년 270만 명으로 증가했다. 팔로군과 신사군도 130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이 되었다.
서북의 오지에서 기사회생한 공산당은 동북의 대지에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 일본이 떠나간 만주가 국공 내전의 주 무대가 된 것이다. 만주는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곳이었다. 북중국에 거점을 둔 마오쩌둥에게도 사활적인 장소였다.
다시금 地理(지리)가 공산당에 유리했다. 만주의 북쪽에는 소련이, 서쪽에는 몽골이 자리했고, 남쪽에는 갓 북조선이 들어섰다. 만주 벌판이 어느덧 소비에트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던 것이다. 만주에서 국민당을 제압한 공산당은 일사천리였다. 만리장성을 넘고, 황하를 건너고, 장강마저 넘었다. 장강을 따라 충칭으로 피신했던 장제스는 바다 건너 대만으로 패주했다.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대 역전패였다. 타이베이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의 억장은 무너졌을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다. 수도는 재차 북경이 되었다.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교체, 새로운 건국이었다. 신해 혁명 이래 40여 년 지속된 난세를 평정하는 대일통의 과업, 즉 天命(천명)을 중국공산당이 완수한 것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인다. 17세기 일본이 중원의 명나라를 흔들자, 동북의 만주족이 중국을 접수하고 대청제국을 세운 역사가 있었다. 20세기에는 대일본제국이 중화민국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변방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20세기에도 중국은 진보를 향해 내달린 것도 아니고, 좌/우의 세력 교체를 경험한 것도 아니다. 누천년 一治一亂(일치일란)의 중국적 순환(Chinese Cycle)을 다시 한 번 반복했을 뿐이다.

▲ 장제스와 마오의 충칭 국공 담판(1945년). ⓒ프레시안
중국의 길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은 미국도 소련도 원치 않던 바였다. 미국은 응당 비공산주의 중국의 지속을 원했다. 장제스가 마땅치는 않았지만 국민당을 계속 지원했던 까닭이다.
소련도 거대한 붉은 중국의 등장을 바라지 않았다. 스탈린은 장강에서 진격을 멈추고 북중국에 족하라고 요구했다. 남/북 분단을 꾀함으로써 동독과 북조선과 같은 또 다른 위성국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1950년에는 최남단 하이난 섬과 최서단 신장까지 복속시켰다. 1951년에는 티베트 고원까지 접수했다. 외몽골을 제외하면 대청제국의 영토를 거의 복구시킨 것이다. 주체 노선의 실현이었고, 자력갱생의 성공이었다.
자력갱생의 기원이 옌안에 있다. 대장정이라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 프랑스와 소련 유학파들은 떨어져 나갔다. 토박이 마오쩌둥이 카리스마를 확립했다. 충칭의 장제스가 전장을 진두지휘할 때, 옌안의 마오쩌둥은 토굴에서 독서하고 사색하고 집필했다. 베이징 대학교 사서 출신이었던 그의 지적 재능이 폭발적으로 만개한 것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한 장본인이지만, 정작 그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상가에 가까웠다. <모순론>, <실천론>, <신민주주의론> 등 마오 사상의 핵심이 되는 문건들이 모두 이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냉전기 신중국이 과시했던 독자 노선의 바탕 또한 이 사상적 독립에 있었다고 하겠다.
비운의 장제스가 눈을 감은 해가 1975년이다. 천운의 마오쩌둥도 1976년 세상을 졌다. 두 거인이 삶을 다함으로써 한 시대가 저물었음이 확연해졌다. 새 천년 충칭에 장제스 기념관이 들어섰다. 그가 항일 전쟁을 이끌었던 관저가 박물관으로 복원된 것이다. 장제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20여년이나 이끌었던 정치 거물이자 항일 전쟁의 영웅이다. 마땅한 대접이다.
대중문화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여실하다. 올해 CCTV에서 방영된 항일 전쟁 특집 드라마들은 공산당 일색이었던 왕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좌편향을 탈색함으로써 상하이 대전투, 난징 대학살, 충칭 대공습 등 그간 국민당의 역사라며 대륙에서 삭제되었던 중일 전쟁의 기억들이 차근차근 복원되고 있었다.
중일 전쟁의 기억 재편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대륙과 대만, 양안 간 화합과 직결된다.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이었던 올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시진핑과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가 최초로 회합한 것도 우연만은 아니지 싶다. 국민당도 공산당도 항일로 하나이다.
그런데 마잉주의 직책이 국민당 주석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국공 합작'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양당의 합작이 아니라 양국의 화합이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통합으로 가는 또 다른 대장정의 출발인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번 세기 중에 '中華國', 혹은 '中國'을 국명으로 삼는 통일 국가의 출현을 목도할지 모른다.

▲ 2015년 11월 7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중국 시진핑과 대만 마잉주. ⓒnetworks.org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속의 중국의 위상과 역할 조정이 항일 전쟁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갈수록 항일 전쟁보다는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이라는 명명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항전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반인류적, 반세계적 조류에 대한 저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공헌이 필요할 때 중국은 전심전력을 다 해 그 몫을 수행했던 바이다. 그 역사의 환기로부터 '책임대국'이라는 최신의 국책 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덤으로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은 물론이요, 그 일본을 거들고 부추기고 있는 미국과도 대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즉 '책임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20세기형 '강대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존하여 패도를 행사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왕도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20세기의 대장정이 21세기의 일대일로와 접속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세기의 대장정이 구국이었다면, 21세기의 대장정은 救世(구세)이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반복하느냐, 개조하느냐의 갈림길에 일대일로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복제하면 인류의 장래가 암담하다.
고도성장이 예외적으로 지속되는 20세기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한 미국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이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로 되돌아가는 21세기에는 고전 문명의 정수였던 중국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출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다.
과연 중국이 패권의 교체가 아니라 문명의 교체를 선도하는 '책임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상과 여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서쪽 깊숙이 들어가기로 한다. 올해로 자치구 성립 60주년을 맞이한 신장(新疆)이다.
[유라시아 견문] 우루무치 : 중국화와 세계화
신장 리스크, '이슬람 분리주의'는 진짜가 아니다!
신장은 크다. 중국의 6분의 1이다. 한국의 17배, 한반도의 8배이다. 유럽의 절반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넓다.
신장은 멀다. 중국의 최서북단이다. 비행기를 타도 베이징에서 4시간, 상하이에서는 5시간이다. 시안에서 버스를 타면 우루무치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
신장은 걸다. 산맥과 사막으로 험하다. 북에는 천산이 남에는 히말라야가 우뚝하고, 사이로는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설산과 모래밭의 공존은 대기의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 눈보라와 모래바람이 동시에 일고, 더위와 추위가 하루에도 수차례 변덕을 부린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드물었다. 지나는 사람들이 머무는 사람보다 많았다. 드문드문 눈이 녹아 물이 고이는 곳에 풀과 나무가 자랐고, 옹기종기 오아시스가 생겨났을 뿐이다.
신장은 낯설다. 중국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Wild Wild West)', 왕년에는 서역이라 불렀다. 西域(서역)을 新疆(신장)이라 고쳐 부른 것이 18세기이다. 이곳을 정복하고 대청제국에 편입시킨 건륭제가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에서 새 이름을 붙인 것이다. 즉, 신장은 200년이 조금 넘은 최신 용어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중국의 시각이다. 서역도 신장도 중원의 관점이다. 유라시아의 지도를 활짝 펼치면 신장은 변방이 아니라 중심, 한복판에 자리한다. 문명의 물결 또한 주로 서쪽에서 밀려왔다. 2000년, 이란계와 투르크계가 유목 문명을 꾸렸고, 1000년, 이슬람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서쪽에서는 이란-이슬람 문명이, 남쪽에서는 인도-티베트 문명이, 북쪽에서는 유목민들의 정치 군사적 압력이 신장의 역사를 주조한 것이다. 반해 동쪽의 중국은 간헐적이었다. 이 유라시아의 동서길항을 역전시킨 왕조가 바로 대청제국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크고 멀며, 험하고 설었다. 신장에 '성(省)'을 설치하고 중국식 제도의 도입을 시도한 것이 19세기 말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동남부에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이, 서북부는 러시아제국이 굴기했다. 조공국(자치국)과 번부(자치구)를 '독립국'으로 분리시켜 식민지로 삼으려 했다. 조공국도 번부도 대청제국의 판도라며 근대적인 어법과 법률로 항변해야 했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 1911년 대청제국이 붕괴함으로써 신장은 다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대청제국을 벗어나자 오스만제국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혈통이 비슷하고 종교가 일치하는 투르크계 이슬람 제국이 유라시아의 서쪽에 자리했다. 우루무치에서 이스탄불로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슬람적 근대화'에 필요한 교사와 관료들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빼어난 신청년들을 이스탄불에 유학 보내는 '서유' 운동도 일어났다. 1910년대 신장의 학생들은 오스만제국의 교과서로 공부하고, 오스만제국의 행진곡을 불렀으며, 오스만제국의 의상을 모방한 교복을 입었다. 오스만제국의 술탄을 최고 지도자라고 배웠다.
그러나 오스만제국도 곧 대청제국의 운명을 따른다. 서구형 민족주의가 주입됨으로써 오스만제국 또한 산산이 찢겨나갔다.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수십 개의 독립 국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제국의 폐허에서 새로 일어난 터키공화국은 난징의 중화민국만큼이나 힘이 모자랐다. 신장은 난징도 이스탄불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주공산이 된 것이다.
이 동/서의 힘의 공백을 메우고 등장한 세력이 북방의 소련이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오스만제국은 몰락했지만 소비에트연방은 굴기했다. 볼셰비키 혁명을 공산주의 국가의 등장이라고만 이해하는 것도 좌편향이다. 20세기형 유라시아 제국이 (재)부상한 것이다. 오스만제국, 합스부르크제국, 이란제국, 대청제국의 파편을 끌어 모았다. 즉, 스탈린 서기장은 서방의 술탄과 북방의 칸과 동방의 황제를 겸직한 꼴이었다.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도 설파했다. 신장 역시 소련의 자장으로 끌려들어 갔다. 상인과 난민과 노동자들이 소련과 교통했다. 물류와 인류(人流)는 문류(文流)도 수반하기 마련이다. 소련의 지적 사조 또한 신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신장은 나날이 적화(赤化)되었다.
1930년대 신장은 소련의 위성국, 동투르키스탄에 가까웠다. 지도자 성스차이(盛世才)부터가 소련이 간택한 인물이다. 그는 요녕성, 동북 출신이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면서 고향에서 쫓겨났다. 소련은 만주의 조선인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고, 항일 의용군들은 서북으로 이동시켰다. 그들을 서북에 포진시킴으로써 몽골과 신장으로 침투하는 일본의 유라시아 진출을 봉쇄하려 든 것이다.
'위구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유포한 인물도 성스차이이다. 중화민국은 '5족공화'를 표방했다. 한족, 만주족, 몽골족, 장(티베트)족, 회족이 중화민국을 이룬다고 했다. 만주국 역시 '5족협화'에 그쳤다. 반면 성스차이는 스탈린식 민족 범주를 도입한다. 신장의 구성원은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카자흐, 타타르 등 14개 소수 민족으로 분류되었다.
스탈린주의도 만개했다. 신장판 공포 정치와 대숙청이 감행되었다. '인민의 적', '제국주의 스파이', '민족주의자' 등의 이름으로 10만여 명이 처형되었다. 즉, 신장의 성스차이는 몽골의 초이발산에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스탈린은 두 사람을 무척 아꼈다. 신형 유라시아 제국의 충직한 제후들이었다.
신장의 형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37년이다. 국민당 정부가 내륙 깊숙한 충칭으로 천도한다. 동부를 일본에 내어준 중화민국으로서는 서부를 총동원해야했다. 신장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중화민국의 기구가 처음 신장에 설치된 것이 1943년이다.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중화민국을 배려하는 포즈를 취했다. 중화민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여 신장에서의 위성국 만들기를 거두어들인 것이다. 마지못한 것이었다.
신장을 완전히 복속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1950년 인민해방군이 진입하고, 1955년 자치구로 만든다. 그러나 좌경적 오류는 반복되었다. 중원에서 통했던 토지 개혁이 서역에서는 화근이었다. 신장 주민들은 농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다. 토지 소유란 부질없고 무망한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에 천명을 하사했던 소농 경제형 '프티 부르주아 사회주의(인민주의)'가 초원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땅보다는 말과 낙타, 양과 당나귀가 소중했다. 대약진 운동 역시 실패했다. 가축을 공유하자는 집단 농장화 시도에 유목민들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공산주의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반동'적 작태였다.
좌경적 오류의 절정은 문화 대혁명이다. 중원의 홍위병들이 궐기했다. 내지의 계급 투쟁은 변경의 민족 탄압으로 변질되었다. 신장 지식인들은 소련의 주구라고 타박하고, 종교인들은 봉건의 잔재라고 질타했다. 수많은 모스크가 폐쇄되고 파괴되었다. 1949년 5만 개가 넘었던 모스크가 문혁을 거치며 1만 개 이하로 줄었다.
알라를 모시던 경건한 모스크가 마오를 섬기는 학교가 되었다. 교재 또한 코란이 아니라 붉은 표지의 마오 어록이었다. 심지어 일부 모스크는 돼지우리로 사용되었다. 돼지고기를 금기로 삼는 무슬림들로서는 더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다. 근대의 우매가 전근대를 향해 가하는 테러의 결정판이었다. 모스크를 후원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을 존중하고 마드라사(이슬람학교) 졸업생들을 관료로 채용했던 대청제국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혁명파의 만용이었다.
유라시아적 지평에서 살피면 유럽의 좌/우 도식은 피상이고 허울이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다툰 동/서유럽보다 훨씬 넓은 강역에서 자유주의/공산주의라는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이슬람주의가 길항했다. 좌/우보다는 고/금 간의 항쟁이 훨씬 치열했던 것이다. 그 동력이 이란 혁명을 촉발시켰고, 소비에트연방을 해체시켰고,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을 무너뜨렸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성과 계몽의 독재에 영성과 신성이 도전한 것이다. 20세기 말에는 소련과 동유럽을 와해시키고, 21세기 초에는 미국과 서유럽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유주의를 막론하고 근대의 세속 문명을 내파해 간다. 좌파의 무신론은 물론이요 우파의 물신주의까지 배격하는 이슬람의 재부상은 긍/부정을 아울러 21세기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다.

▲ 우르무치 설산.
서부 대개발
헌데 이례적으로 신장만은 '위구리스탄'으로 분리되지 않았다. 이웃 나라들과 운명을 달리했던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노선이 변경된 탓이다. 역시 1979년이 분기점이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바로 그해에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이 발진한다.
개혁 개방 또한 좌/우의 시각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사회주의를 거두고 자본주의로 투항한 것이 아니다. 혁명 국가임을 거두고 제국성을 회복해간 것이다. 문혁 기간 삭제된 초기 헌법이 복구되었다. 소수 민족의 평등한 권리 및 정치적, 재정적 자치에 대한 내용들이 복원되었다.
신장에서는 바자르가 다시 열리고 모스크가 새로 지어졌다. 메카 순례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로의 여행 또한 자유로워졌다. 근대 국민 국가의 경직성을 떨쳐내고 고전적 제국의 톨레랑스를 재가동시킨 것이다. 자유주의적 쿨함(다문화주의)의 과시가 아니라, 大德(대덕)의 호방한 발현이었다.
덩샤오핑이 몸소 신장을 순방한 해가 1981년이다. 열흘간 신장을 주유하며 '선부론(先富論)'을 역설했다. 당장은 동남부 연안부터 발전하겠지만, 한 세대 후에는 서북 내륙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독였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100년 대계였다.
새천년, 약속은 이행되었다. 2000년 3월, 서부 대개발이 닻을 올린다. 중국 영토의 6할,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부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초창기 신장의 구호는 '一黑一白(일흑일백)'이었다. 검은 것은 석유요, 하얀 것은 면화이다. 양대 산업을 기둥 삼아 신장 경제를 다져나갔다.
영판 새 바람만은 아니다. 덩에 앞서 신장 개발을 주창한 최초의 지도자로 건륭제를 꼽을 수 있다. 신장을 복속시킨 그는 한족 이주와 토지 개간으로 새 강역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한족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관철하지 못한다. 너무 먼 곳인지라 전략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며 황제의 의사를 기각시킨 것이다.
뒤를 이은 것은 장제스이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대동아 전쟁이 격화되자 '서부로 오라!(到西北来!)'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진 동남부로부터 서북으로 이주하라는 전국적 운동이었다. 교사와 공무원, 기술자를 모집했고, 동반 가족에게는 정착 보조금도 지급했다.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서북에 경제적 토대를 건설하는 한편으로, 빈곤한 변경 지대에서 공산당이 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양수겸장이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로의 서부 개척(Go West!)에 필적할 만한 프런티어 붐이 일어났다. 즉 서부 대개발은 대청제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200년의 숙원 사업이다.

▲ 덩사오핑의 신장 방문(우르무치 역사 박물관 소장 사진).
중국화와 세계화
1991년 소련의 해체가 서부 대개발의 기폭제가 되었다. 19세기 이래 중국을 위협하던 국경 너머의 거대한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다. 20세기형 유라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들어섰다. 일부는 은근하게 신장의 분리 독립도 예측했다. 소비에트연방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마저 주저앉아 '역사의 종언'에 마침표를 찍기를 희구했다.
그러나 기민한 쪽은 도리어 중국이었다. 러시아가 공급해주지 못하는 소비재를 중국이 대신했다. 철강 및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도 중국이 수입했다. 신장은 이들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로 부상했다. 우루무치와 알마티를 잇는 철도가 완공된 것이 1992년이다. 당시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 철교'의 개통이라며 크게 선전했다. 즉, 유라시아를 약동시키는 엔진이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교체된 것이다. 축의 이동이다.
오래 숨죽였던 위구르인들에게도 기회였다. 국경 자유화로 보따리 상인들의 활로가 열렸다. 적지 않은 위구르인들이 이웃 국가로 진출하거나, 중국의 동부로 이동했다. 아랍어를 읽을 수 있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도 능했던 위구르인들의 세계 시민적 잠재력이 십분 발휘되었다.
금세 유라시아적 규모의 위구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혈연과 지연의 오프라인은 물론이요, 송금 경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연결망도 약진했다. 이 위구르 중산층들의 취향은 민족적이면서도 중국적이고 또 세계적이다. 우루무치에는 바자르 풍 쇼핑 센터가 들어서고,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려가는 고층 아파트와 마천루의 내부는 램프와 양탄자로 앤티크하게 꾸민다.
인구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자연 증가가 아니라 이주 때문이다. 기회의 땅을 찾아 동부의 한족들만 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쪽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터키,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카자흐스탄에서 1시간 반, 파키스탄에서 3시간이다. 베이징과 상하이보다 테헤란과 뉴델리가 더 가깝다. 그래서 당일 출장하는 비즈니스맨들도 적지 않다. 유라시아의 한복판에 '범 이슬람 1일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들의 이동 역시 활발하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신장 유학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세기 초의 '서유' 운동과 방향을 달리한 21세기의 '동유' 운동이다. 우루무치 대학의 캠퍼스는 퍽이나 특별했다. 유라시아의 4대 언어,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와 아랍어가 공존했다. 어느덧 유라시아의 교차로, 왕년의 복합 문화 공간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갈등을 운운하며 분리주의를 과장하는 언설들은 호들갑으로 여겨진다. 針小棒大(침소봉대)가 도를 넘는다. 신장의 현재는 지난 300년 이래 중국에 가장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위구르 중산층은 중국공산당의 든든한 우군이다. 이를 발판으로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륙형 연결망의 허브가 되고 있다.
서부 대개발이 일대일로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까닭이다. 중국 내지와 신장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서아시아로, 남아시아로, 유럽으로 거미줄처럼 엮여간다. 송유관과 전신망과 정보망도 구석구석 뻗어간다. 중국의 공산품이 중앙아시아의 바자르를 채우고, 아랍어를 장착한 알리바바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진출한다. '디지털 유라시아'의 탄생도 머지않았다.
고로 신장의 화두 또한 분리와 독립이 아니다. 이 '새 강역'이 '새로운 세계 체제'의 초석이 될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문명 간 공존 체제,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공생과 공영이 요체이다. 본디 중국사의 역동성은 서역에서 비롯했다. 서쪽의 이슬람 문명과 남쪽의 불교 문명과 북쪽의 유목 문명이 중화 제국을 유라시아 제국으로 진화시켰다. 20세기 서구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한족 중심, 유교 중심, 농경 중심, 강남 중심의 중국상이 도드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이 서진을 거듭하면 할수록 胡漢(호한) 융합을 일구어냈던 과거의 찬란한 유산이 미래의 프로젝트로 회귀할 것이다. 즉, 탈냉전 이후 유라시아는 중국화와 세계화의 상호 진화로 운동한다. 중국적 세계화와 세계적 중국화가 공진화한다. 새 천년 우루무치에 '장안의 봄'이 어른거린다.




天地不仁(천지불인)
그러나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우루무치의 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일대일로의 곳곳에 자리한 미군 기지가 걸림돌이라는 말이 아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유라시아의 四通八達(사통팔달)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메가트렌드이다. 人力(인력)으로는 쉬이 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다르다. 천지는 어질지 않다고 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인과응보로 응대한다. 이미 설산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북국과 남극의 빙하만 녹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지붕, 천산과 히말라야의 만년(萬年)설도 녹아들고 있다. 오아시스의 신비를 제공했던 사막의 물줄기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사막의 면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생명수는 줄어들고, 황무지는 넓어진다. 개발의 속도만큼이나 생존의 토대가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天地人(천지인)의 불화가 깊어지고 있다.
본디 인적이 드물었던 곳이다. 그런데 이미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소도시만 산재했던 공간에 국가 규모의 공동체가 들어선 것이다. 더 이상의 인구를 지탱하기 어려운 생태적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미 우루무치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의 나무들은 눈물과 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먹고 자라난다. 즉, 석유와 전기의 인위(人爲)를 통해서 오아시스 도시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인공 도시가 되어버렸다.
임기응변이다.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아메리카의 서부를 개척했던 야망과 야심을 반복해서는 유라시아의 서부 개발도 도루묵이다. 신장 자치구 60주년을 맞이한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5중 전회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유난히 강조했다. 신장의 모래바람이 베이징의 스모그를 가중시키는 와중이었다.
한 달 후 파리에서는 신(新)기후 체제를 모색하는 다국적 협정도 체결되었다. 서쪽에서 발족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쪽에서 발기한 제국의 방책이 인류의 중지(衆智)로 합류하지 못한다면 '오아시스의 봄' 또한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 것이다. 天山(천산)의 설경을 우러러보며 天地不仁(천지불인)을 되새기는 까닭이다.

▲ 천산의 만년설.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다른 백년' : 대반전의 길을 묻다
"코리아, 국운이 기울고 있다"
새 역사
한 해가 저문다. 유라시아 견문 10개월 차다. 벵골만 지나 콜카타에 있다. 아랍어 공부를 시작했다. 인도양 세계와 이슬람 세계로 갈 준비를 한다. 새해는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주력할 참이다. 허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온라인이 말썽이다. 시시각각 나라 소식이 들려온다. 國運(국운)이 기울고 있다는 방정맞은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애가 탄다.
안과 밖의 낙차가 심하다. 북방의 울란바토르에서 남방의 자카르타까지 쏘다녔다. 신장의 카슈가르에서 운남의 샹그리라까지 서역도 살폈다. 동북아와 동남아를 막론하고 한국의 위상을 확인한다. 공항서부터 한국 대기업의 광고판이 휘황하고, 숙소서는 현지어로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쿤밍에서는 카페베네에서 커피를 마시고, 반둥에서는 교촌치킨에서 맥주를 마셨다. 하노이의 주부들은 '강남 스타일'에 맞추어 춤을 추고, 프놈펜의 어린이들은 하얀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운다. 매달 신곡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컴백한 빅뱅의 음악은 동유라시아 도처에서 흘러나왔고, 따리(大里)와 리장(麗江)의 고성(古城)까지 한글로 된 표지판이 친절하다. 마닐라의 택시 기사부터 만달레이의 식당 주인까지 'Anyonghaseyo!'라고 인사한다. 패션부터 음식까지 한류는 세계인의 일상 문화가 되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환영받고 환대를 누린다. 대한민국은 필시 세계화의 물결을 가장 잘 탄 나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면 갑갑하다.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여름에는 학술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가을에는 부산 국제 영화제에 패널로 참석했다. 둘 다 때가 공교로웠다. 전자는 메르스 사태의 말기 국면이었고, 후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의 초입이었다. '세월호' 이후의 세월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어지럽고, 어리석다. 國體(국체)는 망가지고, 國魂(국혼)은 흔들린다. 光復(광복) 70주년, 공든 탑이 무너진다.
업이 업이니만큼 국정화 논란에 무심할 수가 없다. 열불이 나다가도 착잡해진다. 사학계 전체를 좌파로 몰아가는 행태가 황당하면서도, 기존의 교과서에 담겨 있는 역사 인식에는 나 또한 수긍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백 번 찬성한다. 다만 좌편향은 괴담이다. 실상은 근대 편향이다. 좌/우 공히 근대로 기울어졌다.
내 학창 시절 국정 교과서의 기조가 내재적 발전론이었다. 조선 후기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는 억지를 부렸다. 경영형 부농을 부르주아와 연결시키고, 실학을 계몽주의와 잇는 식이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기원은 명백하게 일제에 있다. 개항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었고, 식민지가 됨으로써 전면화되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 조선이, 동방이, 내발적으로 자본주의로 이행할 까닭이 전혀 없었다. 필연보다는 우연이었다. 교통사고 같은 것이었다. 역사도 울퉁불퉁, 돌발의 연속이다. 매끈한 진보사관은 과학이 아니다. 근대의 주술이다.
'자학 사관'도 피장파장이다. 좌/우 모두 전통 문명을 천시한다. 조선은 '중세'로 가두고, 동양은 '봉건'으로 박제한다. 전통과 근대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근대를 華(화)로 섬기고, 전통을 夷(이)로 배척한다. 古今(고금) 간 분단 체제이다.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도 식민지 근대화론도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냐, 일제 시대냐. 오십 보, 백 보이다.
고로 진보도 보수도 올바르지 못하다. 올드레프트도 뉴라이트도 서구 근대를 전범으로 삼는 도깨비 놀이를 반복한다. 교통사고를 낸 쪽을 따지기보다는 도리어 따르려고 한다. 이 도착과 당착의 기원에 개화파가 있다. 동방 문명에 무지한 새파란 선무당들이었다. 개발파와 개혁파도 개화파의 맹점을 답습했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취했다며 각자 뻐겨댄다.
겉으로는 앙숙이지만, 실제로는 짝꿍이다. 산업화+민주화=근대화의 대서사를 공유한다. 그래서 근대 문명의 파국이 임박한 작금의 시대정신과는 도무지 어긋나는 역사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개발파의 시대착오만큼이나, 개혁파도 구태의연하다. '근대 문학의 종언'(=독립적 개인의 성장사)에 이어 근대 사학(=독립적 국민국가의 발전사)도 종언을 고한다.
새 체제
역사 논쟁의 빈곤은 체제 논쟁의 부실로 이어진다. 한때 87년 체제냐 97년 체제냐 논쟁이 일었다. 내발론과 외인론의 사회과학적 판본이었다. 87년 체제론은 내부의 주체적 역량을 과도하게 추킨다. 민주화 세력의 자긍과 자부가 자충수를 연발한다. 반면 97년 체제론은 외부의 충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만사가 신자유주의 탓, 세계화의 덫이란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도 87년도 97년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님이 자명하다. 필리핀, 태국(타이), 대만(타이완) 등이 동시적으로 '민주화'에 진입했다. 즉, 87년 체제는 예외적인 성취가 아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이다. 그리고 딱 10년 후에 금융 위기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다. 냉전기 개발 독재 국가들이 축적한 국부를 글로벌 자본주의가 회수해 간 것이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는 차라리 연속적이다. 민주화가 세계화로 가는 디딤돌이었다. 동아시아에 동유럽까지 보태어 유라시아를 망라하면, 냉전형 좌/우 독재를 허무는 '민주화'(=체제 이행)가 자본이 천하를 통일하는 '평평한 세계'의 전조이자 전제였음이 더욱 확연해진다.
새 천년의 역설은, 그럼에도 세계사의 축이 점점 더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에는 아시아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심장으로 약동한다. 중국(Made in China)이 앞에서 끌고, 인도(Make in India)가 뒤에서 민다. 친디아(Chindia)에 덩달아 '이슬람 자본주의'도 약진한다.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이 만나는 동남아는 이미 한 몸(ASEAN)이다. 19세기의 유럽, 20세기의 아메리카처럼,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의 성장판이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와는 상이한 흐름이 저류에서 크게 일었던 것이다.
그 변곡점에 1992년 한-중 수교가 있다. 1987과 1997년 사이에 대륙과의 재회가 있었다. 시뻘건 '중공'이 아니라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이었다. 그래서 세계화는 곧 미국화라는 등식도 성립하지 않았다. 한국의 세계화는 중국을 경유하는 세계화였다. 대륙을 발판삼아 세계로 나아갔다. 삼성(三星)이 글로벌 브랜드(SAMSUNG)가 된 것도, 한류가 세계인의 대중문화가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래서 냉전기의 미-일 편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여야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냉온탕과 무관하게 일관된 추세였다. 국지적인 정세의 변동이 아니라 역사의 대국, 대세였다. 그래서 불과 20년 만에 지난 100년의 흐름을 역전시킨 것이다. 목하 한국의 사회 구성체는 북조선 못지않게 대륙과 긴박하게 연동되어 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풍경마저 바꾸어 갈 정도이다. 하여 중국론이 결여된 한국론은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다. 87년 체제도 97년 체제도 실격이고 실기했다.
실은 분단 체제 또한 한중 수교로 크게 흔들렸다. 본디 신중국의 개입으로 성립된 체제였다. 분단 체제는 1945년(미-소 담합)이 아니라 1953년(미-중 대결)에 확립된 것이다. 53년 체제였다. 미-소의 유럽형 냉전이 아니라 미-중의 아시아형 냉전의 소산이다. 마오쩌둥이 중국의 남-북 분단을 거부하고 장강을 돌파한 것처럼, 김일성은 한강을 건넜고, 호치민은 메콩강으로 향했다.
중일 전쟁의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길항이 국공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연거푸 추동했다. '항일'이 '항미'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남북 전쟁이었다. 한반도에서는 북-중과 한-미가 길항했다. 그중 한-중이 적대 관계를 청산했으니, 분단 체제 또한 결정적으로 기울어졌던 것이다. 곧바로 불거진 것이 북핵 사태이다. 문민화 대 선군 정치, 비대칭적 분단 체제의 시발이었다.
돌아보면 한중 수교는 '장기 21세기'의 출발이었다. 1894년 청일 전쟁 이후 한국은 탈중국화의 일백년을 경험했다. 식민지가 되고 분단국이 되었다. 식민지 근대화 30년, 분단국 산업화 30년, 속국 민주화 30년이 대륙과 동떨어져 진행되었다. 하여 1992년은 반도의 남쪽이 다시 대륙과 연결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00년 만에 재회한 중국은 동아시아에 자족하는 왕년의 중화제국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중간지대론과 삼개세계론을 경유한 유라시아 제국이었다. 한국 또한 대륙과 접맥함으로써 부지불식 유라시아와 접속한 것이다. 동아시아(론)는 그 일부였을 따름이다. 중국화와 세계화의 상호 진화로 운동하는 중국의 서북 너머까지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담론의 넓이와 깊이 자체가 분단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기 북조선 지식인들의 경험 세계는 퍽이나 달랐을 것이다. 과연 분단 체제의 길항은 갈수록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갈라지고 있다. 좌우 이념 대결에서 지리-문명(Geo-Civilization)의 길항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새 문명
2008년 이래 세계 체제의 운명을 중국이 좌우한다. 이른바 '신상태(New Normal)'로 진입했다.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이 중국에 의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양적 완화보다도 중국 정부의 과잉 투자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했던 자본주의를 구해냈다.
양적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연명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실제 경제를 지탱해온 것은 중국의 투자였다. 자국의 인프라 정비와 주택 건설 등에 재정을 쏟아 붓고, 원자재와 에너지도 왕성하게 수입했다. 그래서 중국이 부진하면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글로벌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단기 처방이다. 오래갈 수 없는 임기응변이었다. 작년(2014년)부터 폐해가 도드라졌다. 거품이 푹 꺼지고 있다. 올 여름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주시할 대목은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방치했다. 올해부터 투자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대신 '신상태'라는 언설을 널리 유포했다. 중국도, 세계도, 고도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향후 저성장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연일, 연중, 떠들어댄다. 선전이고, 선동이다.
물론 반동파도 있기 마련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으로 거품을 재차 일으키고자 하는 관성적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반(反)부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개혁 개방에 도취되고 성장(의 떡고물)에 중독되어 있던 공산당 상층부 유력자들을 제거해간다. 이들은 언제라도 외세(의 담론적 지원)를 등에 업고 다당제와 시민 사회로 작동하는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다. 시민 혁명으로 인민 혁명을 뒤엎어 권력을 시장으로 넘겨 사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재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각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영토를 대폭 확장시켰던 민주화=세계화의 전략을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마오쩌둥에 버금간다는 '시황제'의 '독재 권력 강화'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 하겠다. 세계 체제의 전체 판세를 살피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민주주의' 타령만 해서는 심히 곤란하다.
내부 단속과 척결의 반면으로, 외부로는 새 틀을 짜고 있다. 국내의 과잉 투자를 여타 신흥국으로 돌리는 중이다. '일대일로'의 발진이다. 유라시아 전체의 고정 자산(인프라) 투자를 중국이 주도해 간다. 일대일로가 각별한 점 가운데 하나는 화폐의 전환이다. 종래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달러와 유로를 조달하여 국내에 투자했다. 이제는 중국의 자금으로 세계에 투자한다. 올해 인민폐는 SDR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가 승인하는 기축통화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인민폐가 세계의 인민폐가 되어간다.
1945년 이후 미국은 '식민지 없는 제국'으로 군림했다. 군사 기지 연결망과 달러를 통한 금융망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 모든 상품과 자산과 무역 거래의 최종적 가치가 달러로 표시되었다. 탈영토적 지배 방식이고, 비가시적 제국주의였다. 그로부터 70년, 그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제도들이 속속 등장했다. 브릭스 개발 은행이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하고, AIIB는 ADB를 대체한다. 19세기 은화에서 파운드로, 20세기 파운드에서 달러로의 이행에 견줄만한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즉 중국이 경기의 규칙을 새로 쓴다. 미국의 '재균형'에 맞불을 놓고, 맞짱을 뜨기보다는 새 길을 낸다. 미국식 체스 게임에 응대하기보다는 게임의 종목 자체를 바꾼다. 판세를 뒤엎기보다는 판 자체를 갈아버린다. 분단되고 분열된 독립국들을 '거대한 체스판'의 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문명을 잇고, 엮고, 묶어내는 과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는 분할 지배(Devide and Rule)와는 정반대의 접근이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내 안에 너를 품고, 네 안에 나를 심는다. 초국가적(Trans-National)이고 간주체적(Inter-Subjective)이다. 이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근대와 전근대를 시간적으로 분리했던 19세기 이래의 대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대통합과 대융합, 유라시아의 대일통을 이룸으로써 자본주의 이후의 새 문명을 예비하는 것이다. 더 나은 100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다른 100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United Eurasia
2015년, 미래가 언뜻 지나갔다. 9월 3일 전승절, 역사적인 사진이 연출되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의 정상이 나란히 섰다. 그리고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했다. 22세기의 역사가들이 21세기를 회고하며 즐겨 언급할 사진임에 분명하다. 중원과 북방과 반도와 서역이 (다시) 합류했다. 'United Eurasia'의 부상, 세기적인 사건이다.

ⓒ연합뉴스
지난 세기, '抗日(항일)'이 무엇이었나. '脫亞入歐(탈아입구)', 일본이 추종했던 유럽형 근대화에 대한 아시아의 집합적 저항이었다. '진보(Progress)'에 맞선 '道德(도덕)'의 항쟁이었다. 패도에 맞선 왕도의 도전이었다. 20세기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대 축이었다. 21세기에는 유라시아의 대륙주의와 고전적 문명주의가 양대 축이다. 역사의 되돌림, 문명의 되살림. 재생과 중흥이 21세기의 혁명이다.
북경(베이징)은 어느새 다시, 天下(천하)의 중심이다. 모든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베이징으로 통한다. '거대한 체스판'을 촘촘한 바둑판으로 바꾸어간다. 그러나 21세기의 중국이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의 미국처럼 과잉 성장하고 과대 팽창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중국의 왕도에 막연한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 자체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영/미처럼 전일적이고 전횡적인 패권국의 부상을 예상하기 힘들다. 오히려 사물을 제 자리로 돌려놓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 작업을 주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있지 싶다. 유럽은 유라시아의 서쪽 동네가 되어갈 것이다. 미국 역시 태평양 건너, 대서양 너머 아메리카로 돌아갈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진정한 '재균형'이다.
동방의 등불
인도양의 포근한 성탄절, 첫눈처럼 청량한 소식이 들렸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바마드를 깜짝 방문했다. 모스크바에서 카불을 거쳐 뉴델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샤리프 총리의 생일 잔치에 맞춤한 선물이다. 알자지라는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1947년 대영제국에서 독립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갈라섰던 두 나라이다. 그 후 두 차례나 혈전을 벌였고, 지금도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고 있다. 실향민과 이산가족만 1억에 육박한다. 이 남아시아의 분단 국가들이 대화합의 여정에 들어선 것이다.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한 해의 끝이 훈훈하다.
이들을 아우르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또한 국가 간 연대에 그치지 않는다. 힌두 대국 인도와 이슬람 대국 파키스탄은 물론이요 부탄과 네팔, 스리랑카와 같은 불교 소국들도 포함하는 문명 간 연합체이다. 19세기가 연합 왕국(United Kingdoms), 20세기가 연합 중국(United States)의 전성기였다면, 21세기는 문명 연방(United Civilizations)의 전성기가 될 법하다.
도래하는 유라시아의 세기에 한반도가 부응하는 길은 20세기형 분단을 종식하는 것이다. 유라시아의 문명 연방(United Eurasia)에 남북의 국가 연합(United Korea)을 조응시키는 것이다. 북조선은 핵 보유와 세습 권력 안정으로 반등의 계기를 확보했다. 비대칭적 분단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이다. 중원과 북방과 서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나라를 재건하고 更張(경장)해 갈 것이다. 한국도 합류하여 장단을 맞추어야 하겠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도록 못다 이룬 해방과 광복도 완수해야 하겠다. 통일은 대박이고 축복일 것이다. 표류하는 한국호의 (아마도 유일한) 出路(출로)일 것이다.
이곳 콜카타에는 20세기의 시성(詩聖), 타고르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의 생가에서 <동방의 등불>을 음미해 보는 것은 각별한 체험이었다. 1894년 좌초한 東學(동학) 혁명에 감화되어 조선의 '가지 못한 길'을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했다. 한 자, 한 귀 소중하게 되새기며, 새해 '동방의 밝은 빛'을 다짐한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유라시아 견문] 카슈가르 : 東西古今(동서고금)의 교차로
중국에도 '서해(西海)'가 있다!
'각양각색의 집'
카슈가르(Kashgar)에 이르렀다. 신장의 남부이다. 중화 세계의 서쪽 끝이다.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곧장 내달리면 파키스탄이다.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그래서 북신장의 우루무치와도 사뭇 다르다. 우루무치는 위구르 족과 한족이 반반이었다. 카슈가르는 열에 아홉이 위구르 족이다. 이곳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인민광장과 인민대로, 거대한 마오쩌둥 동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도 다르게 흐르는 듯하다. 우루무치만 해도 서부 대개발의 바람이 여실했다. 고층빌딩 사이로 인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카슈가르는 느릿하다. 낙타와 당나귀의 방울 소리가 딸랑거린다. 일요일 바자르의 풍경 또한 10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곳을 처음 다녀간 중국인은 장건(張騫)이었지 싶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러하다. 기원전 128년이었다. 당시에 이미 2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오아시스의 대도시였다. 현장법사도 이곳을 지나갔다. 천축에서 공부를 마치고 시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불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복합 문명 도시의 풍경을 꼼꼼하게 새겨두었다.
그러나 카슈가르의 주인공들은 역시 위구르인이다. 전성기는 1000년 전, 11세기이다. 카라한 왕국의 수도였다. 문화가 크게 번성했다. 위구르 문학을 대표하는 대서사시 <복락지혜>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정치가였던 유세프 카스 하지브(Yusuf Khass Hajib)의 작품이다. 위엄과 격조가 넘치는 그의 무덤에는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랍어로는يوسف خاصّ حاجب, 위구르어로는يۈسۈپ خاس ھاجىپ, 중국어로는 玉素甫‧哈斯·哈吉甫라고 되어 있다. 이 다양한 표기법 자체가 카슈가르의 복합 문명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

▲ <돌궐어대사전>. ⓒbaidu.com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전도 편찬되었다. <突厥语大辞典(돌궐어대사전)>이 그것이다. 유라시아 문명 교류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위구르 족 이슬람 대학자 마흐무드 카슈가리(麻赫穆德·喀什噶里, مەھمۇد قەشقەرىي Mahmud Al Kashghari)가 편찬했다. 아랍어를 사용해 돌궐어를 해석한 획기적인 사전이다.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역법과 천문학 등 다방면을 망라했다. 어학 사전에 백과 사전까지 더한 격이다. 그래서 카라한 시대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전에 실린 세계 지도이다. 놀랍게도 원형이다. 동그라미 안에 카슈가르와 이슬람 세계, 중화 세계를 그려 넣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젤란이 지구를 일주하기 400년도 전이었다.
이 저작들은 돌궐, 아랍, 페르시아 문명이 중화 문명과 교류하고 중첩되고 융합했던 당시의 파노라마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즉, 북아시아와 서아시아는 동아시아와 오래전부터 공진화하고 있었다. 이 대학자들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시기 또한 송나라에서 주자와 정자 등이 등장하여 송학이 확립되어 가던 때와 오롯하게 포개지거나 다소 앞선다.

▲ <돌궐어대사전>에 실린 원형 세계 지도.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송학의 성립에 불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영향도 다대했다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유학으로 꽃을 피운 유라시아의 첫 번째 르네상스부터가 중국만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중원과 서역, 천축의 상호 진화가 빚어낸 인류의 합작품(Made in Eurasia)이었다, '오래된 세계화'의 결실이었다.
오늘날 카슈가르의 문화와 학술의 집약지는 카슈가르 대학이다. 이곳 역시 일대일로의 발족과 더불어 쇄신의 전기를 마련했다. 2015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신생 종합대학이 카라한 왕조의 위대한 전통 계승을 사표로 다진다. 중국의 지방 대학에서 유라시아의 허브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역시 向西(향서) 개방은 向東(향동) 개방과는 다르다. 태평양은 낯선 세계로의 편입이었지만, 유라시아는 누천년의 정감에 기초한다. 2000년의 역사와 새천년의 미래가 캠퍼스의 潛在力(잠재력)을 일깨운다. 카슈가르야말로 東西古今(동서고금)의 교차로라 하겠다. '각양각색의 집'이라는 본뜻과도 안성맞춤이다.
신천하 : 서역과 서해
100여 년 전(1920년대), 미국의 역사학자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가 중국을 방문했다. 상하이나 홍콩이 아니었다. 오지를 쏘다녔다. 북방에 이어 서역을 살폈다. 카슈가르에도 머물렀다. 西北(서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이다. 그가 집필한 책이 바로 [Inner Asia Frontiers of China]이다. 몽골사와 만주사 등 내륙아시아 연구자들에게는 필독서이다. 나도 이참에 손에 들어보았다. 기차에서 카페에서 틈틈이 읽어갔다. 100년이 무색한 훌륭한 저서였다.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 더욱 값진, 시대를 앞서간 서물이었다.
라티모어는 유라시아의 내륙부가 중국사를 추동했다고 독해한다.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중원 중심주의, 한족 중심주의, 유교 중심주의를 일찍이 극복한 것이다. 만리장성 또한 華(화)와 夷(이)의 경계라고 보지 않았다.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의 교호와 교류의 조랑(corridor)이라고 이해한다. 양대 문명을 분단시키지 않고 통합하여 이해하는 得意(득의)를 선보인 것이다. 그의 시각에서 변경은 주변에 머물지 않는다. 왕래 지대이고 소통 지역이다.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공간이다. 카슈가르의 100년 후를 내다보는 先見之明(선견지명)이 번뜩인다.
그러나 정작 그가 중국을 누비던 20세기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서북 내륙과는 다른 충격이 중국사에 가해졌다. 바다의 충격, 해양 문명의 도전이었다. 그의 구분법을 빌면 서방 이전(pre-Western)과 서방 이후(post-Western)로 나눌 수 있다. 선두는 영국이었다. 1820년대 이미 카슈가르 변방까지 접근했다. 1826년 무렵에는 신장의 절반, 남부를 장악했다. 아삼과 벵골의 아편 길(Opium Road)이 신장까지 이어졌다. 아편 전쟁의 전조였다. 반면 신장의 북부는 러시아의 진출이 여실했다. 내륙에 보태어 해양까지 동시에 변방을 잠식해가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서역과 중원의 양자 관계가 삼차 함수로 성격이 변한 것이다.
바다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본래의 무한성과 미지성이 사라지고 있었다. 망망대해가 육지화되고, 영토화되었다. 서방의 자본주의가 구축한 정치질서와 경제 질서가 바다를 땅처럼 나누고 쪼개어갔다. 칼 슈미트가 [the Nomos of the Earth]에서 묘파했던 바로 그 현상이다. 즉,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바다를 육지화함으로써, 고쳐 말해 대양을 서방의 '內海(내해)'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다문명, 다제국, 다국가들이 공존했던 '公海(공해)'가 '領海(영해)'가 되어 갔다. 아랍의 바다와 중화의 바다가 몬순 계절풍에 따라 순환했던 인도양과 태평양 또한 지중해처럼, 대서양처럼 변해갔다. '낯선 세계화'였다.
이 내륙과 내해의 이중적 압박의 탈출구를 신장에서 찾은 이가 공자진(龚自珍)이다. 대청제국 말기의 대학자였다. 그가 <西域置行省议(서역치행성의)>라는 상서를 올린 것이 1821년이다. 신장에 중국식 행정 기구인 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문헌이다. 중원의 사대부로서는 드물게 신장 문제를 중국 전체의 문제로 사고한 선구적 인물이었다.
공자진은 러시아와 영국이 유라시아 전체에서 벌이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돌파하기 위해서 '西域(서역)'을 '西海(서해)'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역의 특징은 바다와 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바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역과 중원을 동시에 숙고하면서 서해라는 묘수를 궁리한 것이다. 四海(사해) 의식에 갇혀 있던 중원에서의 일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그가 말한 서해란 다름 아닌 인도양이다.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자그만 치 200년 전에 모색한 것이다. 그 발상이 목하 실현 중에 있다. 카슈가르에서 과다르 항까지 이어지는 중국-파키스탄 회랑이 바로 그것이다. 카슈가르가 일대(내륙)와 일로(내해)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간다. 즉, 공자진의 서해 구상은 조숙한 지리 혁명, 신천하의 개진이었다. 동해(태평양)과 서해(인도양)를 양 날개로 삼는 兩海(양해) 전략으로 '中國(중국)'이라는 기성의 경계를 돌파한 것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면 '天地東西南北學(천지동서남북학)'의 재정립이라 하겠다. 구천하를 버리고 新天下(신천하), 大天下(대천하)를 구상한 것이다. 세계관의 수정, 세계관의 재건이었다. 그 1821년의 상소가 2021년의 청사진이 되고 있음이 기가 막히다. 200년을 꿰뚫는 혜안이 빛을 발한다. 그가 제창했던 '천지동서남북학'을 내 식으로 풀면 '유라시아학'이 되지 않을까 싶다. 2대양 3대륙을 담아내는 신천하의 신학문이고, 대천하의 대학문이다.

ⓒ이병한

ⓒ이병한
하나이며 여럿인, 여럿이며 하나인
당장의 일대일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사회과학자들이다. 경제학자와 국제관계학자들이 최전선에 자리한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가 일대일로를 촉발했음이 분명하다. 시장 확장의 논리를 수반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수요 창출과 인프라 투자 및 금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맞서 활로를 찾는 지정학적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혀 신선하지 않다. 근대 세계 체제의 반복이고 확산에 그친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지대에서 자연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문화 생태계를 파괴시켜 갈 것이다. 지난 세기의 익숙한 모순과 충돌을 답습할 것이다. 착취와 억압에 저항과 보복이 잇따르는 근대적 악순환이 영겁으로 회귀할 것이다.
'다른 백 년'은커녕 '다시 백 년'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단 그것만이었다면 당장 나부터가 견문에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 또 다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일선을 긋는 문명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긴다. 나아가 '文明(문명)'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성까지도 내장하고 있다고 여긴다.
일단 언어(文)부터가 각별하다. 변경을 내지화하고 바다를 내륙화했던 영토적 발상을 뛰어넘는다. 路(로)와 带(대), 廊(랑)과 桥(교)라는 핵심 한자어부터 탈영토성이 여실하다. 일대일로가 큰 길(大路)을 내면, 회랑과 가교가 오솔길(小路)을 잇는다. 4개의 한자말(路, 带, 廊, 桥) 모두 연결망(network)에 가까운 것이다.
하나같이 교류와 소통, 융합을 촉진하는 매개적 발상들이다. 그래서 다성적이고 다중적이며 탄력적이다. 딱딱하고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다. 동과 서를 분획하고 그 동서의 내부 또한 국민 국가들로 분할해갔던 기존의 세계 체제를 상쇄하고 전복해간다. 전혀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다.
라티모어가 서양 이전(pre-Western)이라고 일컬었던 옛 질서의 갱신에 가깝다. 그래서 다른 국가, 다른 문명, 다른 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적이고 중층적인 복합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라시아의 각양각색의 문명들이 본디 품고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실현해가는 '다함께 르네상스', '더불어 중흥'을 도모해 봄직하다.
애초 중국이라는 나라부터가 다민족 국가일 뿐 아니라 다문명 제국이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변증법으로 반만년을 지속했다. 다양성의 지반 위에 공동성을 세워갔다. 소위 '天下爲公(천하위공)'이다. 따라서 多(여럿)와 一(하나) 또한 모순되지 아니했다. 하나가 單一(단일)로 군림하며 여럿을 억압하지 아니했다.
여럿의 각자 또한 홀로서기를 고집하지도 않았다. 제국 안에 준(準)국가와 차(次)국가가 자리했고, 국가 위에는 또 天下(천하)가 자리했다. 이 복합적 정치 체제가 一卽多, 多卽一(일즉다, 다즉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듭 업데이트 되어간 것이다. 하나이면서 여럿이었고, 여럿이면서 하나였다.
비단 중화 제국만도 아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천 년간 반복되었던 유라시아형 제국들이 대저 그러했다. 그 다양성을 단일성으로 짓눌러 갔던 과정이 소위 '압축 근대화'였다. 하나의 제국이 수많은 하나들로, 국민 국가들로 분화되어갔다. 그에 따라 배타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가 20세기 내내 만연했다.
즉, 국수주의와 근본주의는 근대에 미달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19세기 이전까지 부재했던 현상이다. 근대로 진입하면서 생겨난 신종 질환들이다. 일대일로는 이 근대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再活(재활)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왕년의 多(다)와 一(일)의 동태적 역사 관계를 복원해가야 할 것이다.
카슈가르의 역사 또한 일과 다의 복합적 관계망 속에서만 온전한 서술이 가능하다. 민족사나 국가사로는 도저히 담아낼 길이 없다. 중국사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투르키스탄만의 역사도 아니다. 중화 문명사로도 충분치 않고, 이슬람 세계사만으로도 족하지 않다. 오래전부터 줄곧 다문명 사회였다.
인도 문명, 이슬람 문명, 중화 문명에 유럽(동/서구) 문명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돌궐어와 위구르어,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한자와 러시아어와 영어로 남겨진 이곳의 문헌(사료)들이 다중적 역사, 다성적 역사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합창으로 웅변한다. 천지동서남북학, 즉 유라시아학이 아니고서는 카슈가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大史(대사), 大計(대계), 大選(대선)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유라시아 사관'이라는 것을 궁리해본다. 3대륙 2대양을 크게 잇고 엮는 종합적 역사관의 마련이다. 응당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도 아닐 것이며, 그렇다고 최근의 중국 중심주의로 수렴되지도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천지동서남북'의 재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세기의 역사란 대저 國史(국사, National History)였다. 나라마다 칸막이를 치고 각자의 국가들이 저마다의 터널 속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경주 말처럼 내달려 왔던 것처럼 서술했다. 역사 서술 자체가 이웃과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적대심을 고조시켰다. 좌파도 우파도 진보사관으로 하나였다.
그러나 천지동서남북은 늘 공진화하고 있었고, 유라시아는 항시 還流(환류)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 듯, 물결이 일 듯 문명과 문명이 동과 서로 흐르고 남과 북으로 통했다. 일대일로의 건설(하드웨어)과 더불어 상부상조하고 自利他利(자리타리, win-win)하는 공존과 공영의 역사관(소프트웨어) 또한 다함께 세워가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거대 서사(Grand Narrative)이다. 지구적인 근대 서사의 창출이다. 일상(小事)으로의 함몰이라는 포스트모던적 유희는 시한을 만료했다. 동서고금을 융합하는 유라시아의 大史(대사)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불과 100년 전 동학도들만 하더라도 요순 시대를 '동시대(contemporary)'로 환기하는 장쾌한 역사 감각이 여전했다. 그 장구한 동시대의식과 광활한 공간 감각을 회복해가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견문에 마침표를 찍는 2018년 2월이면 이러한 시공간에 바탕한 '유라시아 사관'의 얼개라도 어렴풋이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참에 향후의 로드맵(road map)을 대강이나마 밝혀두는 편이 낫겠다. 카슈가르는 일대와 일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남아시아로 향할 수도 있다. 나는 南進(남진)하기로 했다. 천산의 구름 남쪽, 云南(운남)으로 가기로 한다. 그곳에서 미얀마(버마)를 거쳐 벵골만 지나 인도로 갈 것이다.
2016년에는 인도양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주력할 예정이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유럽까지 이를 것이다. 유라시아의 문명적 축을 이루었던 양대 세계를 먼저 살피고 유럽에 당도하면 '서구 근대' 또한 유라시아적 맥락에서 상대화하고 역사화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2017년은 '서구 근대'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었던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모스크바를 배꼽으로 삼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살피고 동북 3성으로 되돌아오는 여정을 계획 중이다. 소련발 사회주의가 지배했던 유라시아의 북방을 살피면서 20세기의 혁명이란 무엇이었나를 반추하고 성찰해 보려 한다.
아울러 '미래의 사회주의'를 궁리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역시나 내가 꼽는 핵심어는 '고금합작'이다. 각자의 문명적 고유성과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튼튼하게 결합시키는 신사회주의 프로젝트이다. 20세기의 사회주의는 역사적 문명을 배격하고 배타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쌍생아였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주의는 저마다의 문명에 바탕을 둔 '오래된 사회주의'에 빗댈 수 있을 것 같다.
즉 '역사의 종언'도 아니고 '문명의 충돌'도 아닌 '역사적 사회주의', '문명적 사회주의'이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문적 사회주의'이다. 2050년의 동아시아라면 사회주의(Socialism)라는 꼬리표도 떼어낼지 모른다. '大同世界(대동세계)', '太平天下(태평천하)'라는 옛 말이 한결 더 어울릴 법하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학습하기보다는 孔孟(공맹)을 읊고 老莊(노장)을 행하고 佛心(불심)을 닦을 것도 같다.
2017년은 한국에서도 의미심장한 해가 아닐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다. 민주화가 한 세대를 지나는 시점에 '大選(대선)'을 맞이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근대화를 총결산하는 획기가 될 것이다. 반동이냐 반전이냐, 퇴행이냐 경장이냐를 가름하는 커다란 선택이 될 것이다.
'다른 백년'의 大計(대계)를 좌우하는 정초 선거가 될 것이다. 大史(대사)와 大局(대국), 大勢(대세)에 부합하는 대선이어야 할 것이다. 2년 후의 역사적 선택을 내다보면서 일단은 운남성의 성도, 쿤밍부터 가기로 한다. 대계와 대선에 앞서 大史(대사)부터 그려가기로 한다.
[유라시아 견문] 쿤밍 : 제국의 남문
중국-태국-베트남 사이 5000만 나라가 있다
春城(춘성)
"昆明天天是春天."
공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표어이다. '쿤밍은 날마다 봄날'이라는 뜻이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연중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봄의 도시이다.
비행기에서부터 첫인상이 남달랐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형형색색 전통복장 차림이다. 찰랑찰랑 장식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임에 틀림없다. 실례를 무릅쓰고 출신을 여쭈었다. 묘(苗)족이라고 한다. 윈난(운남) 성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 민족이다.
'소수 민족'이라는 말에 어폐가 없지 않다. 중국 인구의 7%이다. 그런데 14억의 7%이니 1억에 육박한다. 중국 소수 민족의 규모가 일본 전체 인구에 가까운 것이다.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 민족만 55개에 이른다. 그 중 51개 민족이 윈난 성에 살고 있다. 4000명 이상으로 일정한 거주 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수 민족도 25개에 달한다. 또 15개 소수 민족은 오로지 윈난 성에서만 살고 있다. 윈난 성이야말로 소수 민족의 보고인 셈이다. 성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인문 지리는 자연 지리와 불가분이다. 윈난 성의 면적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조금 더 크다. 인구도 5000만 명이니 한국과 맞먹는다. 중국에서는 일개 지방이지만 사실상의 '준(準)국가'이다. 그런데 산지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고원도 약 10%이다. 영토의 9할이 산악 지형이다.
때문에 한족의 이주 또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의 소규모 지역 사회가 곳곳에 산재했던 것이다. 산과 산 사이 골짜기마다 오막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인사를 나눈 묘족만 1000만을 헤아린다. 유럽으로 치면 스웨덴 규모의 '차(次)국가'이다. 두 번째라는 야오족은 450만이다. 덴마크와 엇비슷하다. 유럽의 국민-국가(nation-state) 개념으로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윈난 성마저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 윈난(운남) 성 소수 민족. ⓒ이병한
윈난 성은 자연 풍광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동부의 고산 지대부터 중부의 호수 지역을 지나 서쪽의 설산에 이르기까지 장관이 펼쳐진다.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기에 제격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나는 오토바이를 빌려 사흘을 내달렸다. 호강이고 호사였다. 날씨는 100점이고 경치는 만점이다. 여행자의 극락이고 관광객의 천국이다. 天下絶景(천하절경)이 따로 없다.
이러한 기후와 환경 덕에 보이차를 비롯한 차 재배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최근에는 네슬레와 맥스웰 등 커피도 생산한다. 중국 전역의 스타벅스에서는 윈난 산 커피도 맛볼 수 있다. 담배와 화초 또한 자랑거리이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오래 뒤처져 있었다. 2차, 3차 산업의 발전이 몹시 더디었다. 2015년 기준으로 GDP 3500달러 수준이다. 산시 성, 구이주이(귀주) 성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 중의 하나이다. 차라리 남쪽으로 이웃한 베트남과 비슷한 형편이다. 이 또한 지리 때문이다. 중국의 서남부 모퉁이에 자리한다. 동부 연안에서 시작된 개혁 개방의 물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쿤밍 또한 호젓한 호반 도시를 기대했다. 포근한 날씨에 호숫가를 산책하며 한 숨 쉬어가는 여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큰 오산이었다. 중국은 매번 예상을 빗나간다. 명색이 중국학자인 본업이 무색해질 정도이다. 변방의 한적한 지방 도시가 아니었다. 시내로 들어갈수록 고층 빌딩이 즐비했다.
뭐지 싶어 뒤늦게야 도시 정보를 확인했다. 이미 쿤밍은 인구 800만 명의 대도시였다. 2010년 이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 자금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과연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었다. 땅 아래로는 4, 5, 6호선 지하철 신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땅 위로는 72층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다.
응당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빠질 수가 없겠다. 북으로는 베이징으로 남으로는 상하이까지, 고속도로 20개 노선이 동시에 건설 중이다. 고속철도 못지않다. 12개 노선이 건설 중에 있다. 북으로는 샹그릴라를 지나 티베트의 라싸까지 이어지고, 동으로는 '향동(向東) 개방'의 중심지였던 광저우와 '향서(向西) 개방'의 허브인 충칭과 우르무치와도 연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서남 내륙에 갇혀 있던 쿤밍 시가 중국 전역의 도시들과 촘촘하게 엮여가고 있는 것이다.
요체는 이 연결망이 중국 내부로 그치지 않음이다. 윈난 성은 동남아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타이)은 물론이요 미얀마(버마)와도 이어진다. 미얀마를 지나면 곧장 남아시아와 접속한다. 동북아와 동남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한복판에 윈난 성과 쿤밍 시가 자리하는 것이다.
지리는 재차 쿤밍의 숙명이다. 중국이 '혁명 국가'에서 '열린 제국'으로 변모하면서, 윈난의 운명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제국의 南門(남문)이 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지리 혁명의 허브가 되어간다. 새 역사의 봄맞이가 한창이다. 날마다 봄날이고, 나날이 봄날이다.

ⓒ이병한

ⓒ이병한
제국의 남문
제국의 남문이 크게, 활짝 열렸다. 南大門(남대문)이라 할 만하다. 2015년으로 3회째를 맞은 중국-남아시아 박람회(China-South Asia Expo)가 대표적이다. 일대일로의 발족과 더불어 쿤밍에서 열리는 새로운 국제 행사이다. 그 전에는 쿤밍 수출입 박람회라는 것이 있었다. 2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90년대 이래 윈난 성과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경제 교류를 이끌었다. 이제는 남아시아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두 지역을 아우르는 박람회가 같은 시기에 열린다. 여행하기에 가장 좋다는 6월 중순의 2주간이다. 윈난 성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쿤밍 시 일대가 유라시아 남부의 허브로 변모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75개 국가, 6000개 기업, 2만여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참여했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행, 에너지, 인프라, 물류,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새로운 터전도 마련했다. 2013년 착공에 들어간 쿤밍국제박람회장(昆明滇池国际会展中心)이 2015년 개장했다. 쿤밍의 상징인 커다란 호수(滇池) 근방에 자리한다.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은 인민공원으로 활용된다. 구경삼아 가보았다. 중국답게 넓디넓었다. 이 너른 자리가 다민족 다인종의 人山人海(인산인해)를 이루는 박람회의 풍경을 상상해본다. '시안의 봄'에 못지않은 '쿤밍의 봄'에 빗댈 수 있지 않을까. 주변으로도 건설 붐이 한창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구역을 조성한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와 고급 쇼핑몰이 들어서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매년 '올해의 국가'를 선정해 특별 전시회도 열린다. 2015년의 주인공은 인도였다. 인도의 산업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전람회가 열렸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시안에서 시진핑과 정상 회담을 가진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그래서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윈난 대학교에 중국 최초의 요가학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인도에서 직접 교수들을 파견하여 인도의 철학과 사상, 수행법을 전수할 것이라고 한다. 물류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사상 대국과 종교 대국의 문화 교류, 문류의 일환이다.
인도 외에도 31개 국가에서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고 한다. 몰디브에서는 대통령이 몸소 방문했고, 라오스에서는 수상이 직접 참석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을 맞이한 중국 대표는 국가 부주석 리위안차오(李源潮)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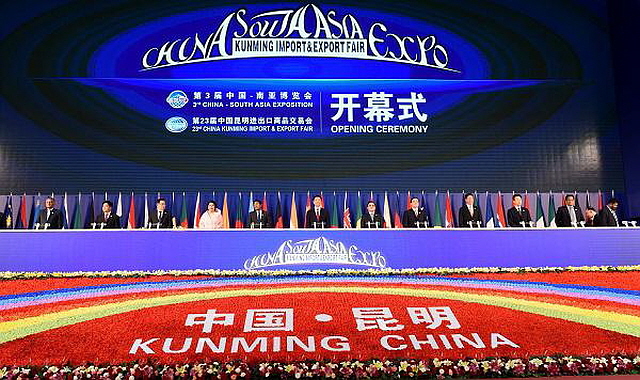
▲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baidu.com
해외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대거 방문은 윈난 대학교와 쿤밍 대학교 등 쿤밍의 주요 대학생들의 '학습장'이 되어주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언어를 전공하는 약 2000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기간 안내자 겸 통역자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이다. 두 종합 대학 역시 일대일로와 보조를 맞추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구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내가 찾은 윈난 대학교에서도 미얀마 어, 방글라데시 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석·박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국어인 중국어에 세계어인 영어를 장착하고 아시아 언어 하나씩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유라시아 시대'를 예비하는 인재상에 가까워 보였다. '유라시아학'의 맹아와 단초도 발견한다.
중국 전도를 치우고 유라시아 지도를 펼쳐본다. 國史(국사)가 역사를 분절하듯이, 國圖(국도)는 세계를 분획한다. 지방(local)과 세계(global)의 복합적 관계망에 대한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종종 국경을 지운 유라시아 전도 위에 도시와 도시를 이어 새 지도를 그려본다. 거리 감각과 공간 감각을 재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는 쿤밍을 중심에 두고 유라시아를 다시 살핀다. 쿤밍에서 상하이까지가 약 2000킬로미터이다. 꼭 그만큼의 거리를 서남진하면 미얀마의 양곤에 이른다. 태평양(동해)으로 향하는 상하이와 인도양(서해)으로 향하는 양곤을 잇는 중간 지점에 쿤밍이 자리하는 것이다. 남쪽으로 또 그만큼의 거리를 뻗어 가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을 지나 태국의 수도 방콕까지 닿는다. 조금 더 내려가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지나 싱가포르까지 이어진다. 상하이와 양곤, 싱가포르를 잇는 삼각 꼭짓점에 쿤밍이 있는 것이다. 새 지리의 배꼽이고 허브이다.
괜히 이 도시들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건설하고 있는 고속철도의 중간 역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지정학(Geo-Politics)적 분류와 지역학(Area Studies)적 구획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북아와 동남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나누고 쪼개었던 지적이고 지리적인 칸막이들을 거두고 치우고 지워가고 있다.
지경학을 통하여 중국의 서남부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한 몸, 한 통으로 묶어가는 새로운 인문 지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후안강이 말하는 '지리 혁명'의 한 사례일 것이며, 19세기의 공자진이 구상했던 '신천하'의 현현일 것이다. 장차 '남유라시아'라고 할 것인가?
동아시아와는 달리 동남아와 남아시아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 200년의 역사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남유라시아'라는 명명이 正名(정명)에 한층 가까울 듯하다.
남유라시아 : K2K, BCIM, GMS
'남유라시아'의 지리 혁명은 각양각색이다. 다층적이며 복합적이다.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간 연합, 국가 간 연대, 지역 간 합작이다.
먼저 K2K 포럼은 도시 간 연합이다. 'Kunming to Kolkata' 혹은 'Kolkata to Kunming'의 약자이다. 쿤밍과 콜카타 간 정기 포럼을 일컫는다. 인도의 동북부 벵골 주에 자리한 콜카타는 'Look East'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Act East' 정책으로 진화했다. 중국 서남부에 자리한 쿤밍은 향남(向南) 개방의 거점이다.
이 양 도시가 2013년 10월 콜카타에서 자매 도시를 맺었다. 2014년에는 쿤밍으로 자리를 옮겨 '21세기형 中印大同(중인대동)'을 다짐하는 쿤밍 선언을 발표한다. 도시 간 연합은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의 필연적 추세라며,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공영(win-win)을 약속했다.
양 도시는 공히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불교 순례'와 '생태 여행' 등 영성을 깨우고 양생을 북돋는 관광 상품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일단 쿤밍에서 콜카타까지 장장 2800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속도로부터 짓기로 했다. 남중국과 동인도를 잇는 세계 최장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국가 간 연대로는 BCIM이 손꼽힌다.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회랑(Bangladesh-China-India-Myanmar corridor)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 역시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제출되었다. 2013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자연스레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자리한 미얀마도 들썩인다. '쇄국 정책'을 오래 고수했던 나라의 빗장을 풀어낸다. 경제 수도 양곤까지 고속철이 이어지고, 벵골 만의 차욱피우(kyaukpyu)에는 항구 건설이 한창이다. 차욱피우에서 쿤밍까지 약 1000킬로미터의 송유관도 건설될 예정이다.
인도양의 동쪽인 벵골 만은 인도의 동북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인도양의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만과 아라비아 해를 지나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진다. 미얀마가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중국과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벵골 만 또한 남유라시아의 '南海(남해)'가 되어 간다.
이 고속철과 고속도로, 항만과 송유관을 따라서 BCIM 분업 체제도 만들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4개국의 합작이 '세계의 공장'을 담당할 것이라며 'Made in BCIM'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4개국의 인구만 따져도 30억, 인류의 절반이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지난 20세기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남아시아'로 분류되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흔히 '동아시아'라고 했다.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분류였다. 동인도와 남중국은 천년이 넘도록 불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했던 공간이다. 이를 따라 물질과 정신의 교류 또한 활달했다. 서방 이전(Pre-Western)의 지리 문명이 BCIM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문 지리가 오래된 자연 지리와 무관할 수 없다. 지역 간 합작으로는 GMS가 돋보인다. 메콩 강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협력 프로그램이다. 메콩 강을 젖줄로 삼아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생과 공영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와 중국을 일컫는다. 현지 언론에서는 GMS 국가(GMS Countries)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연합, 즉 아세안과도 차별되는 또 다른 무리 짓기이다. 메콩강을 줄기 삼아 남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를 아우르는 발상이다. 2014년 9월 개통한 노이바이(Noi Bai)-라오까이(Lao Cai)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인도차이나의 중심인 하노이와 중국의 국경을 직선으로 잇는다. 종전 12시간에서 3~4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GMS 국가들 간의 교통 회랑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중국-베트남은 또 다른 고속도로를 두 개 더 건설할 예정이다.
하노이에 머물던 시절, 하노이와 하이퐁의 모스크가 몹시 신기했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중국에서 독립하기 이전, 즉 대당제국 시절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던 곳이다. 하이퐁과 하노이에서도 아랍 상인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다. 벵골 만과 남중국해를 잇는 바닷길의 중간 역이었다. 하여 남중국해를 두고 양국이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일방적이고 일면적이다. 실제로는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구상에 베트남도 긴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만으로는 GMS 국가들의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AIIB가 주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차이나의 내륙 국가로는 라오스가 있다. 바다를 면하고 있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 내륙 국가가 세계와 연결되는 길은 육로와 하늘길 뿐이다. 아세안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를 중국이 건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2일은 라오스 건국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라오스 국가주석 촘말리 사야손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장더장(張德江)이 고속철 착공식에 함께 참석했다. 비엔티엔의 시장과 쿤밍의 시장이 이들과 동반했다. 쿤밍 시장은 중국의 동부보다도 GMS 국가를 더 자주 방문한다.
때문에 향후 '省-國(성-국) 체제'라는 조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K2K도 BCIM도 GMS도 중국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윈난 성이 주체가 된다. 윈난 성을 지방 정부라고 낮추기도 어렵다. 규모와 인구에서 준국가에 방불하기 때문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도하며 카스피 해와 아라비아 해를 지나 지중해까지 가닿은 연결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윈난 성 또한 메콩 강 국가들과 합작하여 황하-장강-메콩 강을 잇는 문명 복합체를 만들어간다.
나아가 벵골 만을 지나 페르시아 만, 홍해를 잇고 동아프리카까지 연결된다. 얼핏 정화의 대원정이 떠오른다. 어설픈 연상도, 억지스런 비유도 아니다. 정화는 바로 이 윈난 성에 살고 있던 무슬림 집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뿌리'의 소산이다.
윈난史
쿤밍에는 철도 박물관이 있다. 쿤밍이 남유라시아의 교통 허브가 되고 있는 만큼 호기심이 발동했다.
100년 전 기차가 전시되어 있었다. 20세기 초에도 철도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다. 윈난성은 중국에서 철도가 가장 먼저 연결되었던 곳 중의 하나였다. 쿤밍과 하이퐁을 오갔다는 증기 기관차와 프랑스산 디젤 기관도 구경할 수 있었다. 1914년에 첫 운행을 시작하여 무려 65년이나 사용했다고 한다. 1979년까지, 즉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 이 구식 열차를 타고 다닌 것이다. 기관실 내부에는 60년이 묵은 매캐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역시나 철도는 제국주의와 불가분이었다. 유럽 열강들의 중국 과분(瓜分)과 직결되었다. 첫 삽을 뜬 것은 프랑스였다. 인도차이나의 철도 연결망을 완성한 후 남중국까지 노린 것이다. 국경을 맞댄 윈난 성이 첫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에서 1910년까지 윈난-베트남 철도를 건설한다. 100년 전에 이미 하노이와 쿤밍을 연결시킨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남중국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펼치다 이 열차를 타고 하노이에 입성했던 인물이 바로 호치민이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는 영국이 접근했다. 윈난 성 위에 자리한 티베트는 이미 영국의 간접 통치 아래 있었다. 이제는 프랑스가 독점적으로 혜택을 누리던 윈난 성까지 넘보려 든 것이다. 마침 대영제국이 품고 있는 미얀마(당시 버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미얀마를 윈난 성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양곤(당시 랭군)-쿤밍 철도가 완공되면 자연스레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당시 캘커타)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완공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목하 건설 중인 K2K 노선의 원조 격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즉 동북에서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있을 때, 서남에서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제국이 확장되고, 대영제국 또한 그 판도를 더욱 넓혀가고 있었다. 연합국이나 추축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난징에 자리한 국민당 정부는 겨우 중원만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윈난 성은 이 권력의 진공 속에서 군벌이 통치하는 사실상의 자치 상태였다. 다시 말해 '중화민국'의 외부에 자리한 유사 독립국이었던 것이다. 새삼 준국가로서의 윈난사에 흥미가 솟아난다. 살펴보니 비단 서구와 중국 사이의 100년사만도 아니다.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의 1000년사도 절묘하게 포개져 있는 흥미로운 장소였다. 윈난성 최후의 독립 왕국이 자리했던 따리(大理)부터 가보기로 한다.

▲ 100년 전 쿤밍-하노이 철도. ⓒ윈난철도박물관
[유라시아 견문] 윈난 : 이슬람 중국
中 붉은 전사, 이슬람에게 돼지치기 강요-무차별 학살
여행 가이드북이 중국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듣고자 몇 편의 팟캐스트 방송을 다운로드했다. 절반도 듣지 못했는데 따리(大理)에 도착하고 리장(丽江)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것이다. 굽이굽이 산맥에는 터널을 뚫었고, 험준한 협곡에는 다리를 놓았다. 윈난성 내부의 연결망도 갈수록 촘촘해진다. 지도를 다시 그리고, 지리를 다시 이룬다.
두 古城(고성) 모두 하늘과 가깝다. 히말라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다. 공기가 차고 깨끗하다. 오랫동안 한족의 발길이 드물었던 곳이다. 이제는 잘 닦인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따라서 밀물처럼 몰려든다. 날씨는 좋고 경치는 예쁜데다 소수 민족의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도 있다. 지갑이 두툼해진 동부의 중산층들이 유람하기에 제격인 것이다. 샹그릴라, 중국 안에서 異國(이국)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사람이 느는 만큼 돈의 회전도 빨라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상업화의 물결도 가팔라졌다. 애초에 교토를 상상했다. 혹은 경주를 연상했다. 그러나 천 년 도읍의 정취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테마파크 같았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식당이고 카페이고 상점이고 술집이다. 고성 내부에 숙소를 잡은 것도 두고두고 후회했다. 밤새 가라오케와 바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로 시끄러웠다. 아직 문화의 수준이 물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울적한 마음을 '風花雪月(풍화설월)'을 마시며 달래었다. 윈난산 맥주의 이름이다. 한시의 한 구절을 뽑아온 듯한 고졸미가 우아한 상품명이 되어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던 곳이다. 그새 숙소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뻔히 한국 여권을 제출해도 아랑곳없이 중국어로 말을 한다. 노란 얼굴의 동방인은 모두 중국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응대하면서도 유쾌하지 않았다. 짧은 영어조차 배울 이유가 없어진 모양이다. 하긴 투숙객의 9할이 중국인이다. 외국의 배낭 여행객과는 달리 이들은 씀씀이도 크다. 따리 고성의 유명한 洋人街(양인가, '서양인들의 거리')마저도 셀카와 단체 사진 찍기로 여념 없는 한족들로 점령되었다. 탈식민화와 세계화와 중국화가 빚어내는 착잡한 풍경이다. 역시 규모는 중요하다.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
차마고도와 몽골 로드
윈난의 중국화는 최신의 현상이다. 황하와 장강에서 비롯한 중화 문명의 경계가 쓰촨 성 언저리였다. 쓰촨을 분기로 윈난에는 유교와 농경 문화의 영향이 희미했다. 차라리 이웃한 티베트나 미얀마(버마)와 가까웠다.
당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둔 이가 있다. 마르코 폴로이다. 800년 전 이곳을 다녀갔다. <동방견문록>에서도 윈난 성 일대를 중화 문명의 밖으로 묘사한다. 벵골만 건너 인도 문명과 더 유사하다고 느낀 것이다. 크게 틀리지 않은 눈썰미다. 윈난 성이 중국에 편입된 것은 몽골세계제국 때의 일이다. 폴란드에서 한반도까지 유라시아의 대제국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중국의 일부가 된 것이다. 중원과 서역을 통합했던 대당제국의 전성기에도 윈난은 독립 왕국을 지속했다.
윈난의 독자 왕국이 스스로를 무엇으로 불렀는지는 확실치 않은 모양이다. 중국 문헌에는 南詔國(남조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교 왕국이었다. 미얀마와도 인연이 깊었다. 아니 남조국이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얀마의 대표적 불교 도시 바간(Pagan)의 건설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 바간을 통하여 인도의 힌두 왕국과 불교 왕국과도 연결되었다. 남조국의 왕들은 스스로를 불교 황제 아소카의 후예라고 간주했다. 불교 세계 특유의 '만다라 질서'가 작동하고 있던 것이다.
남조국에서는 이 만달라적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역을 간다라(Gandhara)라고 불렀다. 간다라는 불교 법왕들이 다스렸던 평화롭고 신성한 낙토를 일컫는다. 알렉산더 대왕 시기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변경에 걸쳐 자리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Kandahar)라는 지명이다. 미얀마 어에도 흔적이 남아있다. 윈난을 지칭하는 말이 여전히 간다라이다. 왕년의 윈난은 명백하게 인도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이다.
그 천 년의 역사는 오늘날 소수 민족의 '풍습'으로 남아있다. 태국(타이),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의 불교 국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물놀이 축제 송크란이 유명하다. 서력으로 4월이다. 윈난의 일부 소수 민족도 춘절보다는 송크란을 즐긴다. 리장의 터줏대감, 나시(纳西) 족이 대표적이다. 오래전 茶馬(차마)고도를 통하여 티베트와 인도를 윈난과 연결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토착어 또한 티베트어와 미얀마 어에 가깝다고 한다. 만다라 세계와 중화 세계, 불교 문명과 유교 문명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 후기의 귀족들이 유교적 소양을 갖추어갔던 것처럼, 나시 왕국의 귀족들도 점차 중화 문명에 물들어갔다는 점이다. 四書三經(사서삼경)을 공부하고 詩書畵(시서화)를 교양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집안에 경전을 보관하는 도서관을 지어 '구별 짓기'의 상징 자본으로 활용했다.
나시 왕국의 대표적인 귀족의 집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남아있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송나라의 사대부를 모방했음이 확연하다. 다만 차이라면 서재에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걸어두었다는 점이다. 야생과 야성의 과시가 여전했다. 외래의 선진 문명과 현지의 토착 문화가 기묘하게 공존한다. 혹시 외풍이 없었더라면 윈난에서도 한반도와 유사한 역사 전개, 즉 불교 왕국에서 유교 왕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윈난 성 바로 아래 베트남의 역사처럼 말이다.
그러나 윈난은 유교화/중국화가 아니라 이슬람화를 먼저 경험한다. 외풍은 북풍이었다. 몽골이 진격했다. 1253년 쿠빌라이 칸이 大理國(대리국)를 복속시킨다. 행정의 중심을 쿤밍으로 옮긴 것도 쿠빌라이 칸이다. 윈난을 중국의 10개 성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지 민족이나 중원의 한족에게 통치를 맡기지는 않았다.
북방의 몽골 족과 서역의 투르크 족을 이동 배치시켰다. 관료와 군인 등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윈난으로 대거 유입된 것이다. 흑해의 터키인도 있었고, 볼가 강의 불가리아인도 있었다. 당시 윈난에는 동쪽의 한족보다 서쪽에서 온 투르크족이 훨씬 더 많았다. 불교에서 이슬람으로의 전환, 과연 윈난의 역사는 동아시아보다는 남아시아의 경로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가장 유명한 이로는 오마르(Sayyid Ajall Shams al-Din Omar)를 꼽을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출신이었다, 집안의 계보를 따지면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가닿는다. 몽골이 정복한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면서 명성을 쌓았다. 그 경력을 인정받아 1270년대에는 윈난 성의 통치를 맡게 된다.
청렴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모양이다. 중원의 선진적 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윈난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윈난의 무슬림 중 상당수는 오마르를 시조로 삼고 있다. 윈난의 무슬림들도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의 교우가 빚어낸 흥미로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대청제국 아래서는 삼분천하를 이루었다. 토박이였던 소수 민족과 떠돌이였던 무슬림과 한족들이 윈난의 小天下(소천하)를 형성했다. 지각 변동은 태평천국 운동에서 비롯했다. 天下(천하)를 뒤엎고 天國(천국)을 열고자 하는 시도에 대청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했다. 덩달아서 이슬람교에도 불똥이 튀었다. 다문명을 품어 안았던 제국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윈난에서도 무슬림 지도자가 떨쳐 일어섰다. 뚜원시우(杜文秀)가 대표적이다. 따리를 재차 수도로 삼아 독립 왕국을 선포했다. 그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지방의 무슬림 상류 집안 출신이었다. 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과거에도 응시했다. '빼어난 문장'(文秀)이라는 이름에서도 묵향이 가득하다.
그러나 청나라가 제국성을 잃어가면서 이슬람 독립국의 꿈을 키운 것이다. 자신을 '술탄 술레이만(Sultan Suleiman)'이라 고쳐 부르고, 따리에 마드라사(이슬람 학교)를 세워 아랍어 교육을 보급했다. 한문으로 번역한 코란도 출판했다. 콜카타에 무슬림 대표단을 파견하고, 런던에는 아들을 보냈다.
남조국과 대리국을 잇는 云南國(운남국)의 하산(Hassan) 왕자라며 지원을 호소하고 무기를 요청했다. 대청제국 대신 대영제국에 기대어 자립과 독립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대영제국은 무굴제국을 식민지로 삼고 오스만제국도 붕괴시켰다. 뚜원시우의 이슬람 국가 만들기는 16년 백일몽으로 마감되었다.
그의 집도 박물관이 되었다. 이슬람 거상의 후예답게 부티가 흐른다. 외양은 중국식이고, 내부는 이슬람식으로 꾸몄다. 아랍어와 한문 서적들이 빼곡한 서재가 인상적이다. 그의 반란과 궐기에 대한 중국어 설명을 읽어보았다. 왜곡과 곡해가 심하다. 무슬림 봉기였다는 점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
'回民起義(회민기의)'라는 이름 아래, 봉건 왕조에 저항했던 혁명적 농민 봉기라고 되어 있다. 뚜원시우 역시 '농민 장군'으로 묘사한다. 중국공산당의 공식 서사에 끼워 맞춘 좌편향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동학 혁명'을 독일 농민 전쟁에 빗대어 '갑오 농민 전쟁'으로 서술했던 근대 역사학의 착오를 여기서도 목도한다. 나라면 이슬람의 중흥 운동이자 윈난의 '更張(경장)' 운동이었다고 고쳐 말했을 것이다. 알라를 섬기면서도 공맹을 따랐던 그의 정신세계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버마 로드
흔들리는 대청제국의 빈틈을 영국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왔다. 1876년 영국이 윈난과 미얀마(당시 버마) 간 국경 무역 권리를 앗아간다. 민간의 자유 무역이었던 '互市(호시)'를 박탈시킨 것이다. 1886년 미얀마를 대영제국에 병합한 이후에는 국가 간 공식 무역이었던 조공도 폐지시켰다.
청불 전쟁에서 이긴 프랑스 또한 대청제국의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소멸시키고, 민간 무역을 독점했다. 윈난의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해관 설치 권한도 프랑스가 획득했다. 윈난은 20세기 또한 중국화가 아니라 탈중국화, 서구와의 대면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동부의 베이징과 상하이가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이 양분했던 동남아시아와 깊숙하게 연루되었다.
정치적으로도 기우뚱한 상태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상호 견제 속에서 식민지화는 면할 수 있었다. 일본이 러시아를 누르고 만주를 독점했던 동북과는 판이 달랐다.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의 길항 속에서 윈난을 통치한 이가 龍雲(용운)이다. 외눈박이 군벌로, 1927년부터 1945년까지 근 20년을 지배했다.
가계를 따지고 올라가면 남조국 귀족의 후예라고 한다. 1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독자적인 화폐도 발행했다. 그가 표방한 것 역시 '신중국'이 아니라 '신운남'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삼민주의가 아니라 운남 애국주의를 가르쳤다. 5000년 중국사가 아니라 남조국과 대리국에서 출발하는 1000년 운남사를 전통과 적통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신운남'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1937년 중일 전쟁이다. 일본과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항일 연합 노선에 대한 요구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즉, 항일 연합이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좌우 합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지방에서 준독립, 반자치를 누리고 있던 모든 세력들의 대동단결을 요청했다. 일본으로 말미암아 윈난의 '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먼저 한족들이 밀려왔다. 중화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상하이와 난징이 무너지면서 동부 사람들이 대거 서부로 이주했다. 국민당 정부의 수도를 충칭으로 옮긴 파장이 쿤밍까지 미친 것이다. 쓰촨의 충칭이 항일 전쟁의 정치적 중심이었다면, 윈난의 쿤밍은 전후 복구를 예비하는 문화적 중심이었다.
1938년 설립된 西南聯合大學(서남연합대학)이 상징적이다. 동부의 명문 대학과 고급 인력이 쿤밍에 집결했다. 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쿤밍-하노이 철도를 통하여 도서 구입 등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쿤밍이 중국에서 가장 지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도시가 된 것이다. 일약 중화 문명을 고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지난 1000년사에 유례가 없던 전면적 중국화의 시기였던 것이다. 1946년까지 지속되었던 서남연합대학의 유산은 현재의 윈난 대학교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변방의 대학임에도 훌륭한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그 유명한 '버마 로드(Burma Road)' 또한 이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다. 동부 연안이 일본군에 점령당하면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와 접한 윈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버마 로드는 항일 전쟁을 수행하는 중화민국의 '생명선'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고준산맥과 급류가 흐르는 협곡 위에 도로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장비 부족을 대신한 것은 인해전술이다. 소수 민족까지 포함하여 약 20만 명이 동원되어 도로 공사를 강행했다. 1년 만에 버마 로드를 완공했으니, 윈난 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적이었다. 이 버마 로드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의 원조 물자가 보급되었다. 석유와 무기, 식량과 의료품 등 전시 필수품들이 중국에 전해졌다.
중국 정복을 목전에 두었던 일본군이 좌시할 리 없었다. 버마 로드를 끊어내기 위해 윈난을 공습했다. 일부 지역이 점령되어 백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삽과 곡괭이로 도로를 만들었던 이들이 이번에는 총과 칼을 들었다. 이 항일 전쟁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윈난의 소수 민족까지도 비로소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과연 '抗日(항일)'은 신중국 건설의 척추였다.
1942년 일본은 미얀마를 직접 점령함으로써 버마 로드를 단절시켰다. 이에 중국, 영국, 미국의 대표단이 뉴델리에서 회동한다. 인도의 동북 콜카타(당시 캘커타)와 중국의 서남 쿤밍을 잇는 또 다른 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인도의 아삼과 벵골 지역에서 쿤밍을 직접 연결하는 공중 보급로도 마련했다. 미 공군 보급부대가 급히 조직되어 인도와 중국 간에 물자 운송을 담당했다.
그러나 히말라야 일대는 기류가 복잡하고 지형도 험난했다. 3년간 히말라야를 넘지 못하고 추락한 비행기만 500기가 넘는다. 이처럼 항일 전쟁기 동인도와 동남아, 남중국은 하나의 戰場(전장)으로 긴밀했다. 바로 이 지역이 K2K, BCIM, GMS로 하나의 市場(시장)이 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백 년'의 발동이 걸린 것이다.

전장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그 100년의 이행기에 혁명도 자리했다.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된 것이다. 윈난의 중국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완수되었다. '제국의 남문'에 앞서 '혁명의 관문'부터 통과해야 했다. 윈난에 산재해 있는 독실한 무슬림들에게는 특히나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 현장을 부러 찾았다. 샤디엔(沙甸)이라는 마을이다. 이슬람을 믿는 몽골 족의 후예들이 모여살고 있다. 쿤밍에서 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세 시간 정도 걸린다. 구청 건물부터 특이했다. 모스크형 건축 위에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공산당과 이슬람의 공존을 상징한다. 그 앞으로 앳된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중동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새까만 베일을 두르고 있다. 잠시 멈추더니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한다. 귀를 쫑긋하니 중국어이다. 까만 베일과 중국어, '이슬람 중국'의 단면이다.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대 모스크로 향했다. 휘황한 모스크의 양쪽으로 '愛國(애국)'과 '愛敎(애교)'가 새겨져 있다. 묘한 긴장감이 전해진다. 정작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순교자 기념비이다. 문화 대혁명 기간 숨진 사람들을 모셔둔 곳이다. 그러나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마을인지라 순교비의 위치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택시를 타기로 했다.
"순교자 기념비로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쳐다본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거긴 왜 가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질문을 쏟아낸다.
샤디엔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장청즈(張承志)라는 작가 때문이다. 중국 문단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족 출신의 소설가이자 산문가이다. 한창 그의 책을 탐독하던 시절이 있었다. 마침 내 중국어판 킨들에도 서역 기행의 감회를 담은 그의 산문집이 저장되어 있었다. 기사 아저씨에게 보여주자 순간 얼굴이 환해진다. 화색이 돈다.
"장청즈도 알아요?"
길 안내는 물론이요 택시비도 받지 않았다. 저녁까지 사겠단다. 뜻밖의 호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다. 기꺼이 응했다.

윈난 성 혁명위원회에서 인민해방군 1000명을 샤디엔에 파견했다. 일종의 '하방'이었다. 혁명열에 불타는 붉은 전사들은 이슬람을 믿는 촌민들을 무시하고 적대했다. 모스크를 숙박 시설로 삼아 기거했고, 촌민들에게 돼지 사육을 강요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고 남은 뼈를 마을 우물에 버리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경멸이고 치욕이었다.
격분한 신도들이 쿤밍에 있는 성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도리어 탄압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반혁명 폭동을 진압한다며 더 많은 군인들을 파병했다. 비극의 절정은 1975년 7월 29일이다. 새벽 3시부터 무차별 포격과 총격이 개시되었다. 소총만이 아니라 대포까지 동원되었다. 삽시간에 불바다와 피바다로 변했다. 거의 모든 집과 모스크가 붕괴되고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7700명 주민 가운데 900여 명이 사망했음이 공식 기록이다. 그러나 사후에 병사한 이들까지 합하면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즉사한 900명의 희생자 가운데 기사 아저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누나 등 일가족 9명도 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매일 같이 기념비에 들려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18살 때 경험한 비극이다.
어쩌면 그리도 잔혹했을까. 혁명의 맹목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 쿤밍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니 동아시아를 갈라놓았던 분단 체제도 한 몫 했던 것 같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분열과 적대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윈난 성 당국은 냉전기 내내 미얀마에 남아 있는 국민당 잔당의 침투를 경계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간첩을 보냈던 것처럼, 양안 간에도 첩보전이 상시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미얀마와 접한 윈난이 주된 침투지였다고 한다. '버마 로드'를 통하여 대륙 수복의 기회를 엿본 것이다. 소수 민족을 독려하여 분리 독립을 선동하는 공작도 적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중소 분쟁도 영향을 미쳤다. 신장을 동투르키스탄으로 독립시켜 소련에 편입시키려는 획책이 없지 않았다. 1969년 양국이 국경 전쟁까지 벌인 마당에 소련의 사주로 윈난서도 이슬람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신경질적 반응이 상당했던 모양이다. 양안의 분단과 중소의 분열 등 냉전기의 온갖 모순이 이 작은 마을에 응집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꾸역꾸역 살아간다. 살아남은 만큼 살지 못한 이들의 몫까지 더 잘 살아야 할 것이다.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아연 달라졌다. 어느새 맥주에서 백주로 주종도 바뀌었다. 가족들과 이웃들도 속속 합류했다. 그런데 그 면면이 참으로 가관이다. 회족에 장족, 몽골족이 섞여 있고, 윈난의 토착민인 나시 족과 바이(白) 족도 있었다. 하나의 가계도 안에 4개, 5개 민족이 뒤엉켜 있는 것이다.
종교 또한 잡종이다. 기사 아저씨는 이슬람교를 믿는데 처제는 도교를 따르고 며느리는 티베트 불교의 신자라고 했다. 당장 떠오른 것이 중국의 사상가 왕후이가 말하는 '트랜스 시스템 사회(跨体系社会)'라는 발상이다. 중화 제국의 사회 구성체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최신의 개념이다.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여겨졌던 개념에 순간 뼈와 살이 붙어 확연한 실감으로 다가온다. 샤디엔 마을의 구성원, 가족과 친족, 이웃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트랜스 시스템 사회'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문명이 '家族(가족)'의 울타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 복합적 기층 사회를 토대로 '천하' 또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족보부터가 일대일로의 연결망과 오롯하게 포개짐이 기가 막히다. 오마르를 시조로 삼아 중국의 샤디엔과 이집트의 카이로가 핏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방의 내몽골부터 남방의 윈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서부를 주유하면서 이슬람의 흔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신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감숙성과 청해성 등 중국의 서부 전체에 무슬림이 널리 퍼져있다. 곳곳에서 모스크를 목도하고, 사이사이에 '淸眞客棧(청진객잔)'이라는 할랄 여관도 자리한다. 그래서 이 일대를 일컬어 '이슬람 중국'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다소 과장된 어법이지만 복합제국으로서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발상임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그만큼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공진화는 오래된 것이다. 즉, 중화제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유불도(儒佛道) 타령만 해서는 곤란하다. 유불도 삼교의 동방 문명과 서역의 이슬람 문명은 줄곧 불가분으로 연동하고 있었다.
그 천 년의 유산이 '백 년의 혁명'으로 사라질 리도 만무하다. 아니, 목하 中國(중국)과 中東(중동)의 상호 진화를 추동하는 기저가 되고 있다. 샤디엔의 대 모스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중동인과 중국인의 모습에서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의 '더불어 중흥'을 예감한다. 마침 시진핑은 2016년 첫 해외 순방으로 중동 3개국을 선택했다. 짚어보기로 한다.

▲ 중국식 모스크
[유라시아 견문] 신상태 : 중국과 중동의 상호 진화
박근혜가 싸울 때, 시진핑은 "천하대장부!"
신상태
새해 첫 달, 세계 경제가 휘청했다. 유가는 하락하고 주가는 폭락했다. 표적은 둘이다. 중동 산유국의 파산을 전망하고, 중국의 경착륙을 우려한다. 그러나 공히 허언이고 실언이다. 흑심마저 담겨있는 교활한 언사이다.
유가는 시장의 논리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제 정치와 지정학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번에는 산유국과 미국의 셰일 업계 간 치킨 게임이 치열하다. 사우디가 선봉에 섰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셰일 산업을 주저앉히고 석유 시장의 지배권을 미국에서 사우디로 탈환하려든다.
당장의 재정난도 감수키로 했다. 대응책으로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주식 일부를 상장한다. 아람코는 총자산 10조 달러,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이다. 상장은 국제 부문의 5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애플이나 구글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로써 재정 적자 2년치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1~2년간 셰일 업계와 저유가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정작 위기는 셰일 업계로 옮아갈 듯하다. 이미 만성 적자로 허덕인다. 그 적자를 정크펀드에 의존해 버텨왔다. 셰일 업계가 무너지면 미국의 사채 시장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무리를 거듭하여 자금 회전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유가가 지속되면 달리 수가 없게 된다.
내년(2017년) 여름까지 미국 석유 회사의 3할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셰일 업계는 절반 이상이 파산할 수 있다. 사채 시장의 붕괴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직격탄이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상의 금융 붕괴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 후 유가는 다시 60달러 선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사우디의 예측이다. 믿는 구석이 있다. 일대일로가 진전한다. 아메리카를 대신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주가 폭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는 투자자(와 투기꾼)들의 호들갑이다. 월가의 입김에 놀아나는 언론들도 덩달아 아우성이다. 그러나 중국 위기론은 30년째 반복되는 돌림노래이다. 정작 중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안 된다.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 또한 2억에 못 미친다. 실제 거래 계좌는 1억 안팎이다. 즉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주식보다는 예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저축액이 GDP의 절반에 이른다. 차고 넘치는 외환 보유고에 금까지 넉넉하다.
즉,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2008년 미국식 금융 위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금융이라는 가상 경제가 실물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금과 주식 모두 중국 당국이 큰 손이다. 외부의 작전에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다양한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낮아진 것도 위기의 징후라 잘라 말하기 어렵다. 구조적 이행의 지표에 가깝다. 2015년은 중국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을 앞지른 첫 번째 해였다.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중국에 공장을 두었던 기업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로 이전한다. 즉 중국이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소비와 서비스, 첨단기술이 향후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실업률은 도리어 줄어든 것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현재 중산층만 6억이다. 미국 인구의 2배이다. 2015년부터는 한 자녀 정책도 폐지했다. 여력이 있는 집부터 둘째를 가질 것이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소비 시장은 더욱 커진다. 당장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중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맥도날드,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신년 계획도 하나같이 중국 시장에 명운을 건다는 쪽이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도 거듭 중국어로 춘절을 축하한다. 향후 30년간 글로벌 소비 시장의 '중국화'는 불가역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생산하고 세계가 소비했던 개혁 개방 이래의 '구상태'는 지나갔다. 세계가 생산하고 중국이 소비하는 '신상태'로 진입했다.
2016년은 '신상태'의 첫해로 기록될만하다.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핵심은 역시 일대일로이다. 중국 경제의 병폐인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의 거품을 덜어낸다. 1월 13일, 57개 창립국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도 닻을 올렸다. 한 달 전(2015년 12월)에는 아세안의 경제 통합체로서 AEC(아세안 경제 공동체)도 출범했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화 세계와 만다라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간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주석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동을 방문했다.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사우디와 이집트, 이란을 선택한 것이다. 사우디는 7년, 이집트는 12년, 이란은 14년만이었다. 중국과 중동의 상호 진화,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재)통합에도 박차를 가한다. 비단 중국만이 아닌 것이다. 유라시아 전체가 '신상태'로 진입 중이다. '다른 백년'의 恒産(항산)을 지어간다.
신형 국제 관계
중동 순방에 앞서 중국의 아랍 정책을 총괄하는 백서가 발표되었다. 1월 14일자 <인민일보>에도 공개되었다. 중동에서 발을 빼는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관여(Engagement)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에너지 합작, 고속철도 건설, 문화와 교육 교류, 인민 외교 등 다방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익과 공영에 기초한 신형 국제 관계를 통하여 중동의 평화를 재건하겠다는 뜻이다. 장차 유엔(UN) 개혁, 기후 변화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도 아랍 국가들과 보조를 맞춘다고 한다.
첫 방문지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 사우디였다. 유가 하락에 고심인 사우디에 거액의 구매를 선사했다. 대중국 석유 수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도 합작한다. 장차 결제 통화는 달러가 아니지 싶다. 미국 금융 패권의 핵심이었던 '오일-달러'의 공식을 무너뜨려가는 것이다. 중국과 사우디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도 격상시켰다. 아무래도 미국의 맹방이었던 20세기의 사우디는 차츰 잊어가도 좋을 것 같다.
다음 행선지는 중동 최고의 군사 강국 이집트였다. 마침 '아랍의 봄' 5주년이었다. 중동의 민주화라는 장미 빛 전망이 허위이고 기만이었음이 날로 명확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국가 붕괴와 내전이 이어졌다. 이 혼돈과 혼란으로 이집트는 돈줄까지 메말랐다. 공항에 홍등까지 켜두고 시진핑을 맞이한 연유이다. 유/무상 경제 지원은 물론이요 지지부진하던 신행정 수도 건설도 돕기로 했다. 마침 양국 수교 60주년이었다. '중국 문화의 해'을 선포하는 개막식에도 시진핑이 직접 참석했다.
중동 순방의 정점은 이란이었다. 중동의 대국 이란이 국제 사회에 복귀한다. 그 첫 손님이 바로 시진핑이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도 접견했다. 성과 속의 지도자를 두루 만난 것이다. 세속의 지도자는 곧바로 유럽을 방문하여 세일즈 외교에 분주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서방을 결코 믿지 않는다'며 여전한 불신을 드러냈다.
립 서비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냉전기 CIA의 정권 전복이 처음으로 성공한 나라가 이란이었다. 탈냉전기에도 '악의 축'이라며 '체제 전환'을 호시탐탐했다. 2월 11일 이슬람 혁명 37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반미'와 '반이스라엘' 구호는 여전했다. 미국의 패권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균열을 내갈 것이다. 이란산 석유 역시 유로로 결제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은 관건적인 장소이다. 일대(육로)도 통과하고, 일로(해로)도 지나간다. 실은 서방의 경제 제제 기간에도 중국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했다. 이란의 시장 개방으로 더욱 전면적인 관계 증진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합작으로 '신중동'의 초안을 마련해간다. 시진핑이 강조한 것은 누천년의 역사이다. 중화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으로 거슬러 오르는 오랜 우정을 상기시켰다. 양국은 에너지, 산업, 철도, 항만, 신기술, 관광 등 17개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지속 기간은 25년이다. 2040년까지 비단길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다.
백미는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본부에서의 기조 연설이었다. 중국이 중동의 '균형자'가 될 것을 천명했다. 마침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로 알력이 심해지던 시점이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간 경색 국면에서 중재자의 자세를 취했다. 시리아 내전 해결에도 가담하고 있다. 12월에는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고, 1월에는 반정부군을 접촉했다.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지지도 밝혔다.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예멘에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며 돈 보따리를 풀었다.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식 '재균형'이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이래 중동은 유럽 제국주의의 안방이었다. 21세기에도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리비아 내전 등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의 볼모였다. 100년이 넘도록 화약고가 지속되는 근본적 까닭이다.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서방의 논리가 지속된 것이다. 반면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교조적 민주주의'와 '종교적 원리주의'가 악순환을 거듭한 것이다. 십자군 전쟁이 세속화되고, 근대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견원지간, 천년의 앙숙이다.
중국은 다른 논리를 제시한다. 정경 분리이다. 체제와 이념에 가타부타하지 않는다. 남들의 내정은 본체만체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한다. 경제 교류를 확산시켜 새로운 국제 질서, 신형 국제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과연 중국이라 해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를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아랍 지도자들에게 시진핑이 읊은 것은 <맹자>의 大丈夫(대장부)였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道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절개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무가 지조를 굽게 하지 못하는 것, 이를 대장부라 이르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이슬람 세계에 천하대장부가 울려 퍼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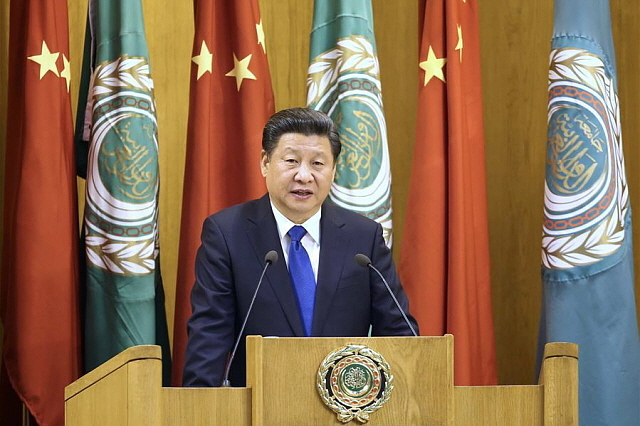
ⓒnews.cn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늘 봄날은 아니었다. 첫 대면은 반목으로 시작했다. 시안에 거점을 둔 대당제국은 서역으로 팽창했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아바스 왕조는 동진을 거듭했다. 양 제국이 충돌한 것이 탈라스 전투(751년)이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치달았다. 양대 제국의 알력으로 육상 교역로는 쇠퇴했다. 실크로드의 중심이 초원길에서 바닷길로 옮아간 것이다. 아바스 왕조도 대당제국도 해군은 부실했다. 인도양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바다였다. 드문드문 생계형 해적만 있었다.
해양 실크로드의 개척자는 상인들이었다. 아랍과 페르시아 출신들이 앞장섰다.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을 엮고, 아랍의 바다를 중화의 바다까지 연결해내었다. 항해 기술과 선박 제조술도 날로 발달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도 늘어났다. 자연스레 지식과 문화의 교류도 증진되었다. 빈번하게 접촉하며 상호 이해도 증진되었다.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의 공존과 공영은 생활인들이 기초를 다진 민간 사업에서 출발한 것이다.
민간의 교류와 교역을 정치적 차원에서 통합한 제국이 몽골이다. 몽골 유목인들이 양대 세계를 융합했다. 1260년에서 1368년까지 두 세계가 하나의 하늘 아래 자리한 것이다. '팍스 몽골리카'라는 보기 드문 盛世(성세)였다. 칼리프(서역)와 칸(북방)과 황제(동방)가 통합되자 제국적 선순환이 작동했다. 관료와 지식인, 군인들의 순환 보직이 일반적이었다. 바그다드를 통치하다가 쿤밍으로 이직한 오마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들을 따라 상인과 장인도 이동했다. 중국의 동남부 연안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무역도 촉진시켰다. 이들을 따라 화교들의 동남아 진출도 활발해졌다. 유라시아의 동서남북에서 상품과 지식과 인간과 생물의 교류와 교환이 정점에 달했던 시절이다.
그 황금시대의 산물 중 하나가 세계 지도이다. 유라시아를 하나로 그려낸 세계 지도가 속속 등장했다. 말미암아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자기중심적 세계관도 일정하게 수정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몽골세계제국의 외부에 자리한 서유럽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그 증거이다. 이 책에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서술도 적지 않다. 아랍어와 중국어로 축적된 사전 지식과 정보가 있었던 것이다. 즉 <동방견문록>은 몽골세계제국이 촉발한 유라시아적 지식을 집대성한 하나의 판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합당하겠다.
몽골세계제국이 해체되면서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는 다시 갈라진다. 티무르 제국과 명제국이 갈등했다. 호전적인 쪽은 티무르였다. 사마르칸트에 터를 두고 명의 정복을 시도했다. 반면 명제국은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지 않았다. 남경을 수도로 삼은 한족 왕조는 유라시아 진출보다는 중화제국에 자족했다.
그럼에도 몽골제국의 흔적은 여전했다. 정화의 대원정이 대표적이다. 바닷길의 이슬람 네트워크를 따라 수차례 동아프리카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아프로-유라시아를 담아낸 세계 지도도 편찬했다. 갓 건국한 조선에서도 세계 지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가 편찬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아랍의 바다와 중화의 바다가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갔던 인도양의 전성기가 유라시아의 동쪽 끝 반도까지 파고를 미친 것이다.
물론 중화 세계가 항상 화평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슬람 세계 또한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응당 중화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교류 역시 훈풍만은 아니었다. 갈등과 대립의 삭풍도 있었다. 그럼에도 두 세계에 남아있는 기록과 여행기들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호의가 주조를 이룬다. 무슬림 지식인들은 중국 장인들의 기술과 넓은 영토와 체계적인 행정 체제와 세련된 문화와 풍요로운 생활을 칭송했다. 중국의 지식인들 또한 이슬람 세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부유하고 세련된 교양인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설과 환상에 기댄 바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에 바탕을 둔 상호 인식이었다. 풍문에 견문을 보태어 천년을 누적한 상호 왕래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1498년, 고아(Goa)에 낯선 이가 도착한다. 기왕의 무슬림들과는 생김새가 달랐다. 리스본이라는 외딴 곳에서 왔다는 뜨내기였다. 이름은 바스코 다 가마라고 했다. 마침내 유라시아의 서쪽 끝 사람들도 인도양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19세기부터는 전혀 딴판이었다. 대양의 육지화, 군사화가 본격화되었다.
지도의 성격 또한 크게 달라졌다. 민간 교류보다는 영토 정복이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투영되었다. 영토성이 연결망을 대신하고, 군사망이 상업망을 대체했다.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의 거개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화 세계는 분열되어 갔고, 이슬람 세계는 더 잘게 분할되어갔다. 이 과정을 문명화니 근대화니 우롱하는 프로파간다도 널리 횡행했다. 이 선전선동을 제도화한 학문이 바로 근대의 역사학이다. 진보(progress)의 대서사가 春秋(춘추)를 대체한 것이다.
유라시아 대서사
민족주의가 화급한 시대정신이 되면서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는 소원해졌다. 그러나 각자도생만으로는 온전한 독립국가가 되기도 힘들었다.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제3세계 운동을 함께 펼치며 양대 세계는 서서히 재결합한다. 이번에는 작가와 지식인, 정치인들이 앞장섰다. 토막토막 난 물류를 대신하여 문류부터 먼저 회복해 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일대일로의 발진 또한 뜬금없는 돌발이 아니라고 하겠다. 20세기를 통하여 교감했던 정신적 연대의식에 육체성과 물질성을 부여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기 신중국과 신아랍 간 연대와 교류의 역사는 일대일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미국의 속국으로 태평양을 해바라기했던 한국은 그 남남(south-south)합작의 유산에 대해 도무지 까막눈이다. 인도양 세계와 이슬람 세계로 서진하면서 차차 복기해 갈 작정이다.
새해 첫 달, 유가와 주가보다 더 흥미로운 통계 지수를 접했다. 국제 해운 동향을 보여주는 BDI(Baltic Dry Index)가 그것이다. 사상 최저 기록을 연거푸 갱신 중이라고 한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고갔던 선박 운항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과 아메리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도 멀어져 가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인도양만 더욱 분주한 것이다. 인도양이 유라시아의 '內海(내해)'로써 공진화하고 있다. 마침 작년 12월 글로벌 운송 기업 DHL은 중국과 터키를 잇는 새로운 철도 연결망을 제출했다. 민간의 물류망 또한 일대일로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 합작으로, 고금 합작으로, 동서 합작으로, 유라시아를 만들어간다.

ⓒdhl.com
이 유라시아의 대서사는 재차 春秋(춘추)에 더 가까울 것 같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온다. 가을이 지면 봄이 온다. 문명의 교류에도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다. 盛(성)과 衰(쇠)가 교차하고, 음과 양이 태극으로 운동한다. 하여 '역사의 종언'도 아닐 것이며, '문명의 충돌'만도 아닐 것이다. 春夏秋冬(춘하추동)의 대서사를 궁리해보고 있다.
진보가 역사를 독점했던 20세기, 3중의 분단 체제가 있었다. 남북의 분단은 좌/우의 분단이다. 이념과 체제의 분단이었다. 전근대와 근대의 시간적 분단도 있었다. '고/금간 분단 체제'이다. 20세기를 전혀 딴 시절인 양 간주했다. 더불어 유럽과 비유럽 간의 공간적 분단도 있었다. 유럽과 그 외부를 별천지처럼 다루었다.
'유라시아 대서사'는 이 시공간적 분단 체제의 극복과 해소를 지향한다. 유라시아의 동/서/고/금 간 회통을 꾀한다. 이 대서사에 남북 통일의 (소)서사도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대서사가 부재하기에 소소사가 갈피없이 표류하는 것이다. 大計(대계)가 없기에 小計(소계) 또한 부실한 것이다.
과연 대안적인 유라시아의 거대 서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시비비와 허허실실에 대해서는 뉴델리에서, 테헤란에서, 바그다드에서, 두바이에서, 카이로에서 거듭 묻고 따져가기로 한다.
[유라시아 견문] 아웅산 수치 : 장군의 딸
'장군의 딸', 결국 괴물이 되는가?
장군의 딸
'황금의 땅(Golden Earth)'에 내렸다.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둠이 깔리면서 거대한 쉐다곤 사원은 더욱 우뚝해졌다. 양곤의 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일견 시간이 멈춘 곳 같았다. 남자들은 긴 치마로 몸을 두룬 론지를 입었다. 여자들은 BB크림이라도 되는 양 다나카를 발랐다. 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인야 호수로 행진했다. 목적지는 대학로(University Avenue)에 자리한 2층 목조 가옥. 그 앞에서 입을 맞추어 'Lady!, Lady!'를 외쳤다.
환호에 화답하듯 아웅산 수치가 등장했다. 나무 상자로 만든 연단 위에 올라섰다. 가택 연금 시절 토요일 오후 4시면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고 한다. 자그마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꽃가지를 비녀처럼 꽂은 상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2015년 11월 7일 총선 전야, 마지막 선거 유세였다. 가까이서 보니 옅은 화장 사이로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1945년생, 벌써 일흔을 넘겼다. 'Lady'가 된지도 어언 30년이다.
1988년이었다. 20년 넘게 지속된 군사 독재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궐기했다. 8월 8일이 상징적인 날이다. 그래서 '8888', '88 항쟁'으로 기억된다. 마침 아웅산 수치가 귀국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근 30년 만에 양곤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곳에서 뜻밖으로 아버지와 조우한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두 돌이 못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해방 공간, 정적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 아버지의 초상이 양곤 도처에 널려 있었다. 거리를 메운 수천의 학생들과 수만의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던 것도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그 중 일부는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에 맞아 죽어갔다. 아버지의 사진도 찢기고 깨져나갔다.
다급해진 학생들이 수치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간절히 동참을 요구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미얀마의 독립 영웅, '아웅산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도 인생도 우연으로 점철된다. 그래서 운명이라 할 것이다. 그녀의 삶도 역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쉐다곤 사원과 양곤 대학에서 대중 연설을 시작한다. 1947년 아버지의 연설을 빼다 박은 내용이었다. '장군'을 환기함으로써, 'Lady'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환생인 듯하였다.
수치가 미얀마를 떠난 것이 1959년이다. 14살 때였다. 어머니가 인도 대사로 취임했다. 그래서 10대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도 뉴델리이다. 20대에는 영국으로 유학 간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가 티베트 문학 연구자 마이클 아리스이다. 책벌레였던 그는 동양의 불교 국가에서 온 아리따운 학생에게 금세 빠져들었다. 둘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의 국적은 자연스레 영국(미얀마의 식민 모국)이 되었다. 그것이 반세기 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족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60년대 후반에는 뉴욕에서 생활했다. 유엔(UN)에서 근무하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당시 미국은 격동기였다. 68 혁명의 한복판이었다. 우드스탁에는 히피들이 집결했고, 유엔 건물 밖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그녀의 일상은 당대의 풍조와는 멀찍했다. 가정과 직장을 오고가는 무사한 나날이 이어졌다.
떠들썩한 뉴욕을 떠나 이른 곳은 히말라야의 불교 왕국 부탄이다. 그곳에서 남편은 왕실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며 박사 학위 논문을 마무리 지었다. 수치는 영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영국으로 돌아간 남편은 교수가 되었고, 수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 역할에 충실했다. 1988년까지 그녀의 삶은 평온하고 평탄했다.
'8888' 이후 수치는 세계적인 명망가가 된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불과 3년 후, 1991년이다. 마침 소련이 해체된 해였다. '역사의 종언'이 선포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만국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 동아시아도, 동유럽도 민주화의 궤도에 진입했다. 미얀마도 다르지 않으리라. 순식간에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등극한 것이다.
'군사 정부 대 아웅산 수치'라는 프레임이 널리널리 퍼져갔다. 미국과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버마 민주화' 인사들도 가세했다. 언론 활동과 로비를 통하여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가중시켰다.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세력은 미국의 네오콘이다. 미얀마를 '폭정의 전초 기지'라고 지목했다. '악의 축' 이라크 후세인의 운명을 지켜본 미얀마 군부는 2005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천도했다. 양곤과 만달레이 사이, 밀림 깊숙이 자리한 이 행정 수도는 지하 벙커로 점철된 인공 요새이다.
10년 만에 그 행정 수도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었다. 돌아보면 2015년 총선은 아웅산 수치에게 최적기였다. 그해 2월 13일이 아웅산 장군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웅산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연중연시 성황이었다. 그 기세에 힘입어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대승이고 낙승이었다. 아웅산에서 아웅산 수치로,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 아웅산 수치의 마지막 유세. ⓒ이병한
버마식 사회주의
아웅산과 수치 사이에 네윈(Ne Win)이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딸의 정적이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접수한 것이 1962년이다. 1988년까지 장장 26년을 집권했다. 유별난 일만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박정희가 등장한 것이 1961년이다. 대만(타이완)도 태국(타이)도 군사 정권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5년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필리핀도 독재 정부였다.
도처에서 군대는 근대의 첨단이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나 개입이 없었다. 이른바 '근대화' 이론에 기초한 개발 독재를 추진하지 않았다. 네윈이 표방한 것은 '버마식 사회주의'였다. 자력갱생을 주창한 마오쩌둥 사상의 변종이었다.
네윈은 1911년생이다. 수치가 미얀마로 돌아온 1988년에는 이미 노인이었다. 군부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말년에는 명상과 요가에 전념했다고 한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영성을 갈고 닦았다. 독재자의 최후는 평화로웠다. 침상에서 숨을 거둔 것이 2002년이다. 근 한 세기를 살아낸 것이다.
엄혹한 시절이었다. 때어났을 때부터 조국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대영제국의 식민지 간에도 위계가 있었다. 양곤(당시 랭군)에는 총독이 없었다. 콜카타(당시 캘커타)의 총독이 버마를 대리 통치했다. 영국과 인도의 중층적 식민지였다.
혈기왕성한 민족주의자였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대동아공영권을 세우자는 일본이 접근해온 것이다. 버마 해방을 선도할 최정예 30명을 선발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으로 데려가 혹독한 군사 훈련을 시켰다. 그곳에서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교육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일본군의 진도지휘 아래 배양되었다.
미얀마의 '선군 정치'는 최장수일뿐더러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군사 독재이다. 민간 정부 위에 군부가 군림하기보다는 군대 자체가 곧 국가였다. 경제와 행정 등 국가 전 영역이 군대와 일체화되었고, 장교들이 장관으로 국사를 처리했다. 네윈 나름으로는 이유가 없지 않았다. 그는 군부가 전권을 쥐지 않으면 미얀마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여겼다. 근거가 없지도 않았다. 이웃 인도는 파키스탄(1947년)과 방글라데시(1971년)로 차례차례 분할되어 갔다. 동아시아의 분단과 남아시아의 분할을 주시하고 있었다.
전시 상태도 그치지 않았다. 대전이 끝나자 냉전이 닥쳐왔다. 미얀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륙에서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 군이 미얀마까지 패주해왔다. 동북부 샨(Shan) 주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윈난성 재탈환의 기회를 노린 것이다. 대만으로 패퇴한 장제스가 무기 공급을 지속했다.
미얀마 군부로서는 응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개의 중국'이 자국 내에서 경합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했다. 자연스레 군부에 힘이 실렸다. 성과도 거두었다. 1961년 국민당 잔군을 완전히 국경 밖으로 몰아낸다. 라오스와 태국으로 밀어낸 것이다. 작년(2015년) 이맘때 소개했던 태국 고산 지대의 화교 마을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샨 주의 소수 민족들이 준독립에 해당하는 자치를 요구했다. 동부서는 카렌 족이 북부서는 카친 족이 일어섰다. 실제로 미얀마는 30개가 넘는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 국가이다. 일종의 '미니 제국'이다. 영토도 영국과 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크다. 그 영토의 절반이 고산 지역이다. 그래서 소수 민족들이 5000만 인구의 4할을 점한다. 인문 지리에서 윈난성과 흡사한 것이다.
네윈은 협상으로 타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고 여겼다. 우격다짐 소제국의 실상을 국민국가의 틀 속으로 우겨넣어야 했다. 무릇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근다. 자발적 쇄국 정책, 주체 노선이었다.
따라서 1988년의 민주화 운동을 88 항쟁으로만 기억해서는 미진하겠다. 다른 민주화 요구도 있었다. 평야에서 (버마족이 절대 다수인) 시민들이 봉기하자, 산악 지대의 소수 민족들도 덩달아 궐기했던 것이다. 중국과 태국의 국경선을 따라 소수 민족들이 재집결 했다. 윈난 성의 와(Wa) 족들과 생활 세계를 공유하는 미얀마의 70만 와족 들이 가장 먼저 이탈해갔다.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소수 민족 샨 족 역시 태국으로 솔깃했다. 이들도 혈통으로 따지자면 버마 족보다는 타이 족에 더 가깝다. 살림살이 형편도 태국 쪽이 더 나아보였다.
그리하여 1989년 전격적으로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수정한다. '버마 족 패권'에 저항하는 소수 민족들의 불만을 일부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실은 '버마'라는 이름부터가 영국이 부여한 것이다. 식민지 이전의 마지막 왕조가 '미얀마'였다. 수도의 이름을 '랭군'에서 '양곤'으로 바꾼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버마'를 고수하고 있음을 일방으로 편들기가 힘들어진다. 버마 족이 중심이 된 '영국식 민주주의로의 이행'만이 8888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제국의 실제에 부합하는 연방제형 국가로의 전환 또한 88 항쟁의 자명한 요구였다.
실제로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미얀마 군부와 소수 민족 간의 다양한 정전 협정이 체결된다. 무려 17개의 반군 조직과 평화 협상을 체결했다. 1960년대부터 봉기하여 가장 강경하던 카친 독립군을 비롯하여, 카렌 민족군과도 화해했다. 독립 이후 근 반세기 만에 항상적이었던 내전 상태가 (일시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고산 지역에 살아가는 수백만의 소수 민족도 비로소 일상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비록 불완전했을망정 적지 않은 성과였다. 그럼에도 외부에서는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오로지 '민주 대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카메라와 마이크는 늘 아웅산 수치로만 향해있었다.

▲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병한
미얀마식 자본주의
내전 상태를 봉합함으로써 미얀마 군부는 개발 독재형 군사 정부로 이행했다. 왕년의 한국, 태국, 대만, 필리핀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를 지향했다.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개발 독재'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근대화'에서 '민주화'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민주 정권 아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개발 독재 정권이 축적했던 국부를 회수해가는 것이 세계화의 목표였다. 이를 거부하는 미얀마에는 봉쇄와 제제를 강화했다. 스스로 자폐를 선택했던 나라를 더 고립시키는 설상가상의 전략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 옆에는 중국이 있었다. 선교의 전통이 없는 이 나라는 남들 내정에는 무심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을 우회하여 개발 독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차츰 중국의 번영이 미얀마 변경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이웃 태국의 정책도 바뀌었다. 냉전기 CIA의 지원 하에 미얀마의 소수 민족을 무장시켜 군정의 전복을 꾀했던 태국 역시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리를 선택했다.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군사 정권의 지속이 나쁘지 않았다. 태국의 민주 정부와 미얀마의 군사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곧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군사정부를 승인했다. 1997년에는 아세안에도 가입했다.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자연스레 '버마식 사회주의'가 '미얀마식 자본주의'로 전환되어갔다. 동유럽과는 상이한 동남아식 탈냉전이었다.
당장 양곤의 번화가부터 변화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건물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부티크 호텔로 재개장하거나 레스토랑과 바로 변신했다. 미얀마 중산층들은 반세기만에 소비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10대들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장군들은 명품 골프장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마침 동북아에서는 한류도 불어왔다. 내가 머무는 동안에도 TV에서는 온종일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다. 그 덕을 톡톡히 누렸다. 아웅산 박물관의 관장이 몹시 환대해준 것이다. 손자가 <주몽>의 열렬한 팬이란다. 박물관 안내를 자청하여 아웅산 장군의 일대기를 설명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산간의 소수 민족도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달라졌다. 미얀마와 중국 간 국경 무역이 재개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한 손에는 미얀마의 자원을 들고, 다른 손에는 중국의 산업혁명이 생산하는 상품을 쥐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미얀마에 전파하는 전위부대가 된 것이다. 윈난 성에 사는 소수민족들과 핏줄로 연결된 '꽌시' 또한 주효한 전략이 되었다.
점차 산골의 시골마을이 국제무역도시가 되어갔다. 내가 이틀 밤을 보낸 망라(Mang La)라는 국경 마을은 '작은 중국'에 방불했다. 양곤이나 만달레이보다 더 흥청망청이었다. 24시간 ATM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밤새 문을 여는 술집도 적지 않았다. 쿤밍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위안화를 마저 사용할 수도 있었다. EXO의 히트곡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며, 북조선의 나진 선봉도 이러할 것인가 잠시 상상해보았다.
인구 이동의 방향 또한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태어난 신세대들이 대거 북진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하여 국경 지대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향락과 부패도 스며들고 있다. 혼자 앉아 있노라니 유혹의 손길이 다가온다. 'lady boy'라고 불리는 트렌스젠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성들까지 섹스 산업이 활황이다. 주 고객은 중국 남부에서 온 사업가들이나 미얀마의 화교 자본가들이라 한다. 그들은 위한 카지노와 보신용 야생동물 식당도 성업 중이다.
시진핑이 반부패 칼날을 휘두르면서 마카오 출입이 어려워진 부호들이 이곳을 부쩍 찾는다고도 했다. 이 지하경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푸젠 성과 광둥 성 출신의 조폭들도 진출하고 있었다. 미얀마의 동북부는 확연히 대중화경제권에 편입된 모양새다. 숙소 직원들도 영어는 알아듣지 못해도 중국어는 곧잘 말했다.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와 무연할 수 없겠다. '미얀마식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군부 또한 헌법 개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군부가 의회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술책을 강구했다.
양곤에서 만난 BBC 특파원은 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1920~30년대 영국의 버마 통치를 참고했을 것이란다. 당시 대영 제국은 버마의 의회에 가능한 천천히 권력을 이양하는 방법을 궁리했다.
과연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식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2003년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군부와 수치 간의 비밀 협상도 개시되었을 것이란다.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점진적 이행'에 양 세력이 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제법 그럴싸한 견해이다.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그가 쓴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얘기는 한 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추론'에 내가 보탠 것은 중국과의 관계였다. 이미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선거에 앞서 아웅산 수치가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과 리커창은 그녀를 '국빈'으로 예우하며 연쇄 회동을 가졌다. 중국이 군부뿐 아니라 야당의 대표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중국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책임대국으로서의 풍모를 과시했고,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 자신을 승인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내부적으로는 군부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일정한 조율을 마친 끝에 11월 총선이 열렸던 것이다. '관리된 민주화'였다.
역사의 단층
선거 사흘 후 NLD 당사를 찾았다. 도로 가에 자리한 허름한 건물이었다. 정문이랄 것도 마땅히 없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외국인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가운데 말쑥한 양복 차림의 백발 백인이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두 팔 벌려 맞아준다. 자기 자리로 안내하여 차까지 대접했다. 나는 <프레시안>에서 파준 명함을 건네고 저널리스트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다. 군복을 벗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돌아왔다. 총 대신에 성경을 든 것이다. 비록 전쟁에서 졌을망정 복음을 전파해야한다는 사명감마저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수단을 바꾸어 공산주의와의 성전을 지속한 것이다.
그의 삶도 고단했다. 베트남에서는 추방되었고, 캄보디아에서는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 마지막 선교지가 미얀마였다. 주로 고산 지역의 소수 민족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 평야에 내려와서는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그 일념으로 미얀마에서 산 지 20년이 되어간다. 그 사이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카렌 족 여인과 새 가정을 꾸렸다. 딸은 13살이다.
그는 시종일관 들떠 있었다. 수치의 승리로 말미암아 청년 시절의 회한을 비로소 만회한 듯 보였다. 그녀에게 동지애 혹은 전우애를 느끼는 듯했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일흔을 넘긴 어르신과 논쟁하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집권 여당을 목전에 둔 NLD 당사 안에서 말이다.
내 생각은 좀 나르다. 낙관을 금한다. 도리어 걱정이다. 이미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둘러보고 난 차였다. 이웃나라 태국은 민주화 이후의 혼돈 끝에 군사 정부로 돌아간 상태이다. 더 불길한 것은 '폭정' 이후의 나라들 때문이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의 발칸이 떠오른다. 2000년대 후세인 제거 이후의 이라크가 연상된다. 2010년대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도 비슷하다.
인종 학살과 종족 간 폭력이 분출했다. 미얀마는 건국 이래 70년 가까이 내전 상태를 지속해온 나라이다. 그 내분을 억지로 억눌렀던 군부가 약화되고 다수결로 운영하는 선거제가 가동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민주 내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소련이 떠나고 난 아프가니스탄도 '민주주의 국가'였다.
외부에서는 이번 총선을 군부와 수치의 대결로 묘사하지만, 실제로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양당만이 아니었다. 무려 100개에 육박한다. 산간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대변하는 지방 정당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이들이 차지한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상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로 참정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그 비중이 20%에 달한다. 그들이 보기에 이번 선거는 '버마족 패권주의'의 압승일지 모른다.
의회를 장악한 버마 족들이 군부와 타협하여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전혀 허황한 전망만도 아니지 싶다. 수치는 선거를 전후하여 서북부 아라칸 주에서 발생한 무슬림 난민 사태에 시종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이다. 실제로 로힝야 족은 버마 족과 어울려 살아본 경험이 없다. 차라리 인도양 건너 오만과 더 연결되어 있었다. 스스로를 글로벌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다.
미얀마의 60%를 점하는 버마 족은 독실한 소승 불교 신자들이다. 군사 정부와 결탁해 왔던 불교계에서는 '불교 근본주의'라 할법한 현상마저 불거지고 있다. 스님들이 무슬림에 가장 적대적이다. 버마를 복원하여 불교 정토를 만들자고 한다.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계 소수 민족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기 십상이다. 수치 또한 표를 먹고 살아야하는 현실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치를 대신할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도, 내가 더 주목한 소식은 카렌 족의 일부가 재무장을 시작했다는 뉴스이다. 부디 그녀만은 아버지의 운명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미얀마에 가기 전, '중국과 인도 사이'라고 생각했었다. 막상 가보니 영국풍이 여실했다. 쇄국 정책 탓에 더더욱 영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양곤이 그러하다. '랭군'이야말로 대영제국이 만들어낸 '신도시'였기 때문이다. 벵골 만을 사이로 콜카타와 마주하고 있는 개항장으로 최적의 위치에 자리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와의 연결망으로서도 제격이었다. 즉, 영국으로 말미암아 미얀마의 중심이 만달레이에서 양곤으로 옮아간 것이다.
나라 이름도 다수 민족의 이름을 따서 버마라고 불렀다. 나아가 영국령 인도의 일부로 편입시키기까지 했다. 시종 미얀마의 지리적-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식민 통치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미얀마'와 무관한 '근대적 버마'가 들어섰던 것이다. 1886년을 기점으로 옛것과 새것 사이에 현격한 낙차가 생겨났다. 미얀마가 싹둑 버마로 동강나서 근대 세계로 내던져진 것이다.
하여 오늘날 미얀마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 또한 대영제국 시절로 거슬러 오르지 않고서는 그 전모를 온전히 살피기가 힘들다. 물론 '유라시아 견문'에서 미얀마 근대사를 통으로 훑어갈 여력은 없겠다. 하더라도 작금 '민주 내전'의 기운을 되 지피고 있는 분열의 기원만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대영제국만큼이나 대일본제국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과 서의 두 제국이 충돌했던 역사적 유산이 지금껏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실상은 실로 복잡다단했다. 대일본제국과 대영제국이 최후를 다투었던 임팔 전투를 복기해 본다.
[유라시아 견문] 임팔 전투 : 제국의 충돌
독립 영웅의 꿈 '백인 여성의 목을 일본도로…'
지는 해와 뜨는 해
글로벌 코리아라는 말을 실감한다. 가는 곳마다 한국 분들이 계신다. 현지에서 보고 느낀 얘기를 청해 듣는다. 그러면 그 나라 못지않게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언론사 특파원을 만나서 인상적인 경우가 좀처럼 드물다. 대개 취재보다는 번역에 능하다. 외신을 소개하는 중계자에 그친다. 구태여 그곳에 살아야 할까 싶다. 사람 탓만은 아니다. 제도적 문제이다. 장기간 체류하며 전문가로 숙련되지 못한다.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 축적이 안 된다. 좀 알 만하면 귀국한다. '박사님보다 아는 게 적을걸요.' 겸손함이 아니라 겸연쩍음이다.
대기업 주재원들도 만난다. '지역 전문가'로 파견된다. 회사에서 학습 비용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현장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한다. 보고서가 직무 평가에 반영되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눈치이다. 덕분에 개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한계 또한 뚜렷하다. 대개 가정부 딸린 집과 운전수를 곁들인 차를 제공받는다. 식사도 업무비로 처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좋은 곳을 찾는다. 교류하는 이들도 관료나 기업가들이다. 사무실 밖, 자동차 밖의 세계는 잘 모른다. 그 사회의 밑바닥까지 훑어 전체를 망라하기는 힘든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전면적 접촉보다는 점과 점의 연결로 작동한다.
내가 선호하는 경우는 사업가이다. 현장에서 승부를 거는 경영인들이다. 현지인들과 매일같이 살을 부딪치며 살아간다. 경영은 절반 이상이 사람 관리이다. 나와 남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연스레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익숙해진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무심할 수가 없다. 상호 진화, 상호 융화가 일어난다.
그 중 일부는 공부에도 열심을 낸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학습하는 '주경야독'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무와 독서가 공진화하여 독자적인 안목에 이른다. 간혹 이런 분을 만나면 견문의 질이 확 달라진다. 100쪽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0분의 대화가 월등하게 이롭다.
미얀마에서도 그런 분을 만났다. 1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얀마(및 동남아시아) 공부를 병행하셨다. 물론 생면부지였다. 그러나 온라인 코리아는 촘촘했다. 인터넷 카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연결망으로 이틀 사이에 접속되었다. 마침 내가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임팔 전투 현장을 가볼 계획이라 하신다. 그때 임팔(Impal)이라는 지명을 처음 들었다.
영국의 제2차 세계 대전사는 독일과의 전쟁에 치중되어 있다. 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사는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일본제국과 대영제국이 다투었던 임팔 전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그런데 이참에 돌아보니 결정적인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유라시아 대전'의 전모를 한층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얀마의 교통망은 부실하고 열악하다. 혼자라면 가기 힘들었다. 그 분 덕에 지프차를 빌려 돌아볼 수 있었다. 운수대통이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파죽지세였다.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인도네시아 등을 차례차례 점령해갔다. 특히 싱가포르가 중요했다. 일본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갈랐다. 영국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사이의 바닷길을 끊어냈다. 해양을 접수한 일본은 태국(타이)으로 들어가 미얀마로 북상했다.
내륙의 미얀마는 싱가포르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위치가 절묘하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자리한다. 이곳을 차지하면 중화민국과 영국령 인도 간의 '버마 로드'를 끊어낼 수 있다. 국민당 정권의 마지막 생명선을 절단냄으로써 마침내 중국 대륙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다.
나아가 벵골 만을 지나 인도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大東亞(대동아)도 모자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 인도를 모두 장악하여 '대아시아 공영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20세기에 실현되는가 싶었다.
해가 뜨는 나라가 약진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저물어갔다. 일본의 미얀마 진격은 콜카타와 델리, 런던을 경악시켰다. 최대 식민지였던 인도마저 풍전등화가 된 것이다. 인도의 규모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인도의 상실은 곧 대영제국의 몰락을 의미한다. 영국은 랭군에서 만달레이로, 만달레이에서 인도의 아삼으로 거듭 후퇴했다. 대영제국 역사상 가장 긴 철수였다.
떠나는 모습도 볼썽사나웠다. 런던의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던 석유 지대에 불을 질렀다. 추격하는 일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시커먼 연기가 불교 성지인 파간(Pagan) 일대를 한 달이나 뒤덮었다. 그 먹구름을 뚫고 동양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편 전쟁 이후 100년, 서구의 지배가 저물고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는 듯하였다.
불꽃과 태양, 그리고 벼락
랭군(양곤)을 점령하는 일본군 사이에 몇몇 미얀마 인들이 섞여 있었다. 맨 앞에 섰던 이가 아웅산이다. 그 옆에 있던 이가 네윈이다. 아웅산은 그들 사이에서 테자(Teza)라고 불렸다. 미얀마 어로 불꽃이란 뜻이다. 네윈(Ne Win)도 개명한 이름이다.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이다. 불꽃과 태양, 욱일승천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들이다.
1940년 8월 14일이었다. 랭군에서 밀항선을 탄 청년이 중국의 샤먼에 내린다. 1930년대 양곤 대학 학생 운동의 지도자였다. 영국의 식민 경찰을 피해 도주한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한 바다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 막상 중국 땅에 내렸으나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허송세월 끝에 중국공산당 소식을 접한다. 한때는 그도 버마공산당에 가담한 적이 있다. 마침내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동아시아의 해방구, 옌안으로 가고자 했다.
우연한 운명이 그를 낚아챈다. 옌안이 아니라 도쿄로 가게 되었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 공산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에 기울게 되었다. 대일본제국의 한 장교가 그를 발탁한 것이다. 타이베이를 거쳐 도쿄에 이르렀다. 당시 도쿄는 제국일본의 수도에 그치지 않았다. 대동아 공영권의 '皇都(황도)'였다. 마침 나치 독일과 조인식을 마친 시점이었다. 축하 행사가 한창이었다. 욱일승천기와 나치 깃발이 붉은 물결을 이루었다. 청년은 압도당했다. 신세계의 서막을 목도하고 있다고 여겼다.

▲ 하이난 섬의 아웅산과 네윈.
아웅산을 발탁한 이가 스즈키 케이지(鈴木敬司)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빗대어 '버마의 스즈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특무기구 '남기관(南機関)'의 기관장이었다. 미얀마(및 동남아시아) 내부에서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반군을 키우고자 했다. 군복을 벗고 언론인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동남아 일대를 주유했다.
그러다 대어를 낚은 것이다. 장래가 촉망받던 미얀마의 청년 지도자를 도쿄까지 끌어 들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의 주도면밀한 지도 아래 청년은 '아웅산 장군'으로 성장했다. 독일과 일본을 모델로 삼은 강력한 국가 건설을 염원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당, 하나의 영도, 미니멀한 파시즘은 황홀한 것이었다. 영국식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지럽고 혐오스런 것이었다. 영국은 지는 해고, 일본은 뜨는 해였다. 아웅산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 이름도 지었다. 자발적 창씨개명이었다.
사상 개조를 마치고 미얀마에 잠입했다. 비밀 공작을 개시했다. 옛 학생 운동권 동료부터 접촉했다. 세계의 정세를 설명하고 일본의 현재를 설파했다. 호응한 이들을 이끌고 중국의 하이난 섬으로 이동한다. 이미 일본이 점령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이동이 한결 쉬웠다. 스즈키 대령이 선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 30인의 지사.
서른 명의 최정예 집단이었다. '30인의 지사'라고도 한다. 6개월간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일장기에 경례하고, 일본 군가를 부르고, 일본식 제식 훈련을 받았다. 스즈키의 훈시도 이어졌다. 아시아의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인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를 박멸하자고 선동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럽인을 죽였는가도 자랑스레 떠벌렸다. 시베리아 전투에서는 러시아 여성과 아이의 목을 일본도로 베어버렸다고 했다. 영국 식민지 출신의 신청년들은 감동하고 감격했다. 감화되었다. 그럼에도 훈련은 너무 고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포기하려 했다. 이들을 격려하며 무리를 이끈 이가 아웅산과 네윈이다. 두 사람은 별도의 특별 훈련까지 소화했다. 둘은 30명이 아니라 3000만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훗날 미얀마를 지배하는 '선군 정치'가 그곳에서 그렇게 잉태되었다.
1941년 11월. 이들은 진주만 공습 한 달 전에 방콕으로 이동했다. 하와이를 미국에서 해방시키는 작전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또한 유럽에서 해방시킬 작정이었다. 버마독립의용군이 정식으로 닻을 올렸다.
이번에는 스즈키 대령도 미얀마식 이름을 갖기로 했다. 모교(Mogyo)라고 지었다. 벼락이라는 뜻이다. 벼락이 되어 영국의 우산을 박살내자고 했다. 미얀마 저잣거리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모교가 미얀마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민동(Mindon)의 장남 밍군(Mingun) 왕자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자 만달레이를 떠나 사이공으로 탈출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도쿄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얀마와 같은 불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힘을 빌려 기독교 국가를 몰아내고자 했다. 마침내 그가 '영국령 버마'를 타파하고 '미얀마'를 복원하기 위하여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뜬소문이고 괴담이다. 스즈키와 아웅산이 합작하여 조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이야 어떠하든 불꽃과 태양, 그리고 벼락의 등장에 미얀마 인들은 환호했다. 그들이 56년 영국의 통치를 분쇄시켰다.
1943년 8월 1일, 독립 행사가 열렸다. 아웅산은 버마군의 수장이 되었다. '하나의 피, 하나의 소리, 하나의 사명'이 군대의 모토였다. 지금까지도 미얀마 군부의 슬로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난 섬에서 훈련된 그 30명의 지사들이 해방 이후 미얀마 정치를 통솔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립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1931년 만주국과 유사한 괴뢰국이었다. 그럼에도 효과는 대단했다. 동남아시아는 대만, 조선, 만주와는 달리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반세기 이상 경험한 곳이다.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를 신봉하는 외세의 억압과 착취를 오래 겪었다. 그래서 비록 허울일망정 독립의 감각적 경험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들의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경례할 수 있었다.

▲ 기모노를 입고 일본도를 든 미얀마의 네윈.
아웅산과 네윈은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도 참석했다. 처음으로 식민지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도 대접받은 것이다. 이로써 1945년 이후 되돌아온 영국은 결코 미얀마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대동아가 동남아 탈식민의 기폭제였음을 통째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45년 말, 영국은 스즈키를 BC급 전범으로 기소하여 미얀마로 연행했다. 하지만 그를 석방시켜 준 이가 아웅산이다. 네윈은 집권 시절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남기관 인사들과 재회했다. 그들과 해후할 때는 다카스키 신사쿠(高杉晋作)의 옛 시절로 돌아갔다. 일본어로 대화하며 추억에 잠기기를 즐겼다.
가끔은 1962년 쿠데타와 군사 독재를 維新(유신)에 빗대기도 했다. 스즈키 대령은 1981년, 미얀마 독립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최고 영예인 아웅산 훈장을 받는다. 대동아의 후일담은 제법 길다.
제국의 종언, 내전의 기원
말이 영국군이었지 그 다수를 점한 것은 인도인들이었다. 인도 용병들이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북진하면서 '버마군'의 규모는 커져갔다. 곳곳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충원해 갔다.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겠다는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버마 족 군대였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군에서 인도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카렌 족이었다. 전형적인 분리 통치였다. 다수 민족인 버마 족은 군대와 경찰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외부에서 온 인도인과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들을 무장시켜 미얀마 통치의 헌병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버마독립군'의 진격으로 카렌 족의 무장을 해제시켜 간 꼴이다.
카렌 족은 영국인 장교와 인도인 병사를 따라서 아삼으로 철수하지 않았다. 고산 지대로 돌아가 가족들을 지키기로 했다. 버마 족으로부터 카렌 족을 수호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램프 속의 지니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다.
아삼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영국은 대반격에 나섰다. '국제연합'군이었다. 이라크에 있던 사단을 인도로 옮겨왔다. 이집트에 있던 2개 사단도 이동시켰다. 유라시아의 서부에 있던 대영제국 군대가 유라시아의 동부 전선으로 결집한 것이다. 여기에 장제스의 국민당도 2개 사단을 파견했다. 미국은 공군을 지원했다.
1944년 3월,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전쟁이었다. 대일본제국은 임팔을 통해 아삼으로 진격하려 했고, 아삼에서 출발한 대영제국은 임팔로 향했다. 영국이 투입한 병력은 50만이었다. 5만 대의 탱크에 인도의 코끼리까지 싹쓸이하여 투입했다. 이에 맞선 일본(과 버마독립군 및 일본에 동조했던 인도국민군)은 20만을 헤아렸다. 임팔 전투는 양측의 사생결단 총력전이었다.
총성이 그치고 포섬이 멈추었을 때, 일본군의 절반에 가까운 8만이 전사했다. 연합군도 2만이 희생되었다. 이로써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제 일본이 퇴각했다. 영국의 미얀마 재점령이 시작되었다. 일본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만달레이 성을 보루로 삼았다. 만달레이 일대에서 두 제국이 대치했다.
대일본제국과 대영제국의 전선이 미얀마를 절반으로 갈랐다. 유럽의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을 합한 것보다 더 거대한 전선이었다. 만달레이 성에서 격전이 일어났다.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장소가 화염에 휩싸였다. 영국이 재탈환한 만달레이는 '식민지 근대성'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잿더미였다. 초토화되었다.
이제는 랭군이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영국은 병사를 충원했다. 카렌 족을 재등용했다. 카친 족도 동원했다. 다급한 김에 자치권을 약속했다. 독립까지도 운운되었다. 버마 족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을 선택한 것이었다. 카렌 족과 카친 족은 버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영국에 의지한 꼴이었다. 동서 양대 제국의 충돌 이면에서 종족 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버마 족은 식민 모국 영국에 협조하는 카렌 족과 카친 족을 즉결 처분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카렌 족이 운영하는 교회와 고아원에도 불을 질렀다. 그러면 카렌 족도 버마 족 마을을 습격하여 보복을 개시했다. 정글에서는 카친 족의 활약이 돋보였다. 다리와 철도를 폭발시켜 일본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통신을 방해했다. 일본군을 흉내 내어 목을 벤 숫자가 5000을 헤아렸다.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버마 족이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대일본제국은 3년 천하로 붕괴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영제국의 복귀를 원하지는 않았다. 유라시아의 동과 서 끝자락에 자리한 양대 제국이 서로가 서로를 소진시키며 제국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명료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가 불투명했다. 버마 족과 카렌 족, 카친 족 모두가 무장하고 있었다. '독립'에 대한 구상도 저마다 달리했다.
1945년 8월 신생 버마 군대가 생겨났다. 아웅산과 네윈이 이끄는 버마 족들은 일본이 훈련시켰다. 반대편에는 영국이 훈련시킨 카렌 족과 카친 족이 있었다. 직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던 이들이 절반씩을 차지했다. 한 지붕 두 가족은 출발부터 위태로웠다. 일사분란 해야 할 군 조직이 따로 놀기 시작했다. 세계 최장기의 미얀마 내전이 이미 격발되고 있었다.

▲ 1943년 일본 도쿄 대동아회의. 가장 왼쪽이 버마독립군, 가장 오른쪽이 인도국민군이다.
어떤 광복군의 후세
영국에 의지해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것은 카렌 족과 카친 족만이 아니었다. 충칭으로 천도한 중화민국도 영-미와 연합하여 일본을 대륙에서 축출하고자 했다. 여기에 조선인들도 가세했다. 충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임팔 전투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한 번 분리 통치와 以夷制夷(이이제이)를 가동시킬 수 있었다. 카렌 족-카친 족을 통하여 버마 족을 상대했듯이, 일본과의 전쟁에는 조선인을 활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는 어학 능력이 요긴했다. 일본군의 노획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대일 선전전을 수행하는데 적임자였다. 이 업무에 최종 선발된 이가 9명이다. 정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학습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이었다.
이들이 콜카타로 이동한 것이 1943년 8월이다. 그리고 델리로 이동해서 문서 번역과 전단 작성 방법을 배웠다. 장소는 영국군이 주둔하던 레드 포트(Red Fort)였다. 무굴제국의 황궁을 영국군이 사용하고 있던 것이다. 이들을 훈련시킨 사람은 월리엄 선교사였다. 조선말로 강의했다.
그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3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강제 추방되어 인도까지 밀려났던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 3년 후 델리에서 대영제국의 미얀마 재탈환에 투입될 한국광복군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그도 광복군과 더불어 조선반도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교회와 학교가 공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9명의 광복군은 당시에 이미 충칭과 쿤밍, 콜카타와 치타공, 만달레이와 랭군을 넘나들었다. 오늘날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으로 기획되고 있는 지역을 앞서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도둑처럼 해방을 맞은 조국은 분단국이 되었다. 그리고 곧 통일 전쟁이 발발했다. 그 중 한 분은 국군으로써 인민군과 맞섰다. 중국국민당이 아니라 중국공산당과 뜻을 맞추었던 이들과 대결했다.
15년 후에는 동남아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도 또 다른 내전이 한창이었다. 남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통솔하는 고위 간부가 된 것이다. 전장은 시장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제법 큰돈을 모았다. 돌아와서는 군복을 벗었다. 알짜배기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화 물결을 타고 재차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다.
나를 임팔 전투의 현장으로 인솔해준 분이 바로 그 광복군의 외손자였다. 그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를 잇는 한국인 교민지 <인도차이나>를 발행하고 있다. 월간 정보지로 벌써 50권을 넘게 발행했다. 그 독특한 한인 잡지에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들의 '아류 제국주의'를 나름으로 교정해 가고 있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외할아버지가 20세기에 지은 업(카르마)을 풀어내고 싶다고 하셨다. 미얀마인들 만큼이나 그도 불심이 두터운 분이었다.
임팔 전선에 투입된 광복군 얘기도 그 잡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실로 제2차 세계 대전의 내막은 복잡하고 다단했다. 동유라시아 전선은 더더욱 그러했다. 일본을 편들었던 아웅산과 네윈의 무덤에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인가. 미얀마 독립의 반대편에 섰던 한국광복군을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했던 이의 운명은 무어란 말인가.
도저히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아시아의 냉전 또한 자유주의/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다툼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런 양분법이야말로 두터웠던 역사를 말소해버리는 이데올로기이자 프레임이다. 그래서는 동아시아의 대분단 체제도, 남아시아의 대분할 체제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
여전히 20세기는 올바른 이름을 갖지 못했다. 다음에는 독립(1945년)과 독재(1962년) 사이에 자리했던 미얀마의 '가지 못한 길', 해방 공간으로 진입한다.
[유라시아 견문] 삼총사 : 미얀마의 봄
아웅산 수치는 '계몽 군부'의 얼굴마담이다!
아웅산
영국이 만달레이를 재점령하자 아웅산은 총구를 돌려세웠다. 비밀리에 영국과 내통했다. 영국이 랭군(양곤)으로 진격하면 내부에서 합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작전은 5월 3일 단행되었다. 유럽에서 히틀러가 자살한 지 이틀 후였다.
버마독립군은 출정하는 척하다가 회군했다. 일본을 향해 총을 쐈다. 배반이고 반란이었다. 주구가 주군을 물었다. 아웅산은 일본 군복 차림 그대로 영국 사령관을 만났다. 기민하다고도, 기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혹은 둘 다였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기회주의자였다.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 난세였으니, 도덕적 판단은 삼가기로 한다.
유럽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유럽은 재차 동남아시아로 돌아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속속 복귀했다. 그러나 대동아의 '해방'을 맛본 동남아의 탈식민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인도차이나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무장 투쟁이 일어났다. 일본 점령 하에서 군사적으로 더욱 단련되었다.
본국의 사정도 달라졌다. 특히 영국 국민들은 '제국의 영광'에 넌덜머리를 냈다. 7월 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했다. 내정에 집중하라 했다. 복지 국가를 만들라 했다. 대영제국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식민지는 점점 뒷전이 되었다. 매듭을 잘 짓지도 못했다. 곳곳에서 대영제국의 파편으로 분단/분할 체제가 들어섰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이 갈라졌다. 그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삽입되었다. 유럽인과 유태인의 모순을 중동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아랍인과 유태인 간 분단 체제가 생겨났다.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었다. 훗날 파키스탄마저 분화하여 방글라데시가 생겨났다.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가 떨어져나갔다. 미얀마도 비슷한 궤적을 따를 뻔했다. 버마 국, 샨 국, 카렌 국, 카친 국으로 더 잘게 쪼개질 수 있었다. 영국은 아웅산을 버마 족 대표로만 인정했다. 소수 민족을 따로 독립시켜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흑심이었다. 기독교 신도가 다수인 카렌 국을 영연방으로 편입시켜 홍콩처럼 통치하려 했다.
아웅산은 '버마연방공화국(Union of Burma)'으로 응수했다. 각 소수 민족 대표들을 찾아가 달래고 얼렀다. 도출된 것이 1947년 2월 빤롱(Panlong) 협정이다. 빤롱은 가장 많은 소수 민족이 살고 영토도 가장 넓은 샨(Shan) 주의 산간 마을이다. 이곳에서 각 주의 고도 자치를 허용하는 연방제 국가를 합의한 것이다.
그래도 버마 족에 대한 의심이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 수립 10주년이 되는 1958년에 연방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또한 아웅산의 기민한 방책이었는지 기만적인 책략이었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문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협정서에 날인했던 당사자가 5개월 후 암살되었다. 열세 발의 총알이 아웅산의 몸에 박혔다. 초대 정부의 예비 국무위원 9명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7월 19일의 비극은 '순국자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 아웅산. ⓒwikipedia.org
서른 두 해, 아웅산의 삶은 짧고 굵었다. 학창 시절은 공부벌레였다. 영어와 버마어에 능하고, 팔리어까지 섭렵했다. 독서 습관이 유명하다. 묵독이 아니라 암송했다. 불교 경전을 읽듯이 영어책을 소리 내어 읽어갔다. 랭군 대학 총학생회장을 거쳐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 되었다. 이때 네루와 친분을 맺는다. 전국 대학생 의장이 되고 만달레이에서 열린 첫 총회에 네루를 초청한 것이다.
네루는 약관의 아웅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940년 인도 국민회의 대의원 총회에 초대했다. 간디와 네루의 옆자리에 서면서 아웅산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곧장 영국 식민 경찰의 표적이 되었고, 낭인 신세가 되었다. 그를 낚아챈 것이 대일본제국의 스즈키 대령이었다.
그를 암살한 쪽은 우파 진영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노정객의 앙갚음이었다. 사전에 영국과 교감이 있었다는 음모설도 있지만, 문서로 밝혀진 것은 없다. 꼭 그랬을 것 같지만은 않다. 버마공산당의 약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웅산은 활용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 좌파 또한 아웅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렌 족도 카친 족도 그랬을지 모른다. 총구 여럿이 아웅산을 겨누고 있었다. 방아쇠를 먼저 당긴 쪽이 우파였을 뿐이다.
오래 살았더라면 이집트의 나세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베트남의 호치민에 견줄만한 세계사의 주역이 되었을지 모른다. 역사적 인물 대신 상징적 신화가 되었다. 양곤에는 보족 아웅산 시장이 있다. 보족(Bogyoke)은 장군이라는 뜻이다. 보석, 수공예, 의류 등 수백 개의 가게가 밀집해 있다. 남대문시장쯤 되겠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경기장 이름도 보족 아웅산 스타디움이다. 그의 초상화와 사진을 파는 가판대도 많다. 國父(국부)의 존엄을 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름을 남겼다. 꼬물꼬물 두 살배기 딸이 일흔이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아웅산 수치'라는 이름, 혈통이야말로 그녀의 최대 정치 자산이었다.
우누(U Nu)
1948년 1월 4일, 오전 4시 20분. 유니온 잭이 내려갔다. 미얀마의 깃발이 올라갔다. 꼭두새벽에 행사가 열린 것은 미얀마의 민간 신앙에 따른 것이었다. 기운이 가장 좋은 때라고 했다. 영국인들은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제 미얀마의 주인은 미얀마 인이었다.
신생 독립국의 수장이 된 인물이 우누다. 우연이었다. 천운이었다. 다른 일정으로 예비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의 부재를 확인한 암살자들이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홀로 살아남아 초대 총리가 된 것이다. 전망은 밝지 않았다. 미얀마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다. 탈식민 동남아국가들 가운데 가장 유망했다는 것이다.
초창기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버마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널리 회자된다. 식민지 시절 활황을 구가했음이 사실이다. 인도와 동남아를 잇는 대영제국의 이음새였다.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자 석유 생산국으로 파운드가 흘러들었다. 랭군 대학 역시 동남아 최고 대학의 지위를 누렸다.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도 조지 오웰도 버마에서 한때를 보냈다. '버마식 사회주의'로 낙후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는 비난인 셈이다.
과장이 없지 않다. 군사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상상된 과거'를 동원한다. 해방 공간, 미얀마는 허허벌판이었다. 영국과 일본, 동서의 양대 제국이 충돌하면서 식민지 근대성은 사그리 사라졌다. 300명의 무장 세력만 있으면 양곤을 제외한 어느 도시도 탈취할 수 있는 무정부 상태였다.
한때는 제2도시 만달레이마저도 카렌 족과 버마공산당이 점령했다. 나라를 이끌 예정이었던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잃은 채, 또 수많은 내부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태로 신생 정권이 출범했던 것이다. 출발부터 고난의 행군이었다.

▲ 우누. ⓒwikipedia.org
우누는 1907년생이다. 독실한 불교 집안의 자제였다. 전 생애에 걸쳐 불교의 영향이 물씬하다. 양곤 대학 시절 별명이 '철학자 누' 혹은 '돈키호테'였다. 홀로 전통 복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영어 공부에는 열성이었다.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다. 극본을 써서 영국 문단에 응모했다. 그 원고를 버나드 쇼에게 직접 보냈다는 일화에서 돈키호테의 기질이 잘 드러난다. 방학이면 혼자 시골 방을 얻어 집필에 전념했다고 한다. '버마의 버나드 쇼'가 되겠다며 허세도 부렸다.
아웅산과는 막역한 선후배 사이였다. 1936년 대규모 학생 시위도 둘이 주도한 것이다. 영국은 우누에게 유학을 권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를 영문학으로 유혹했다. 단칼에 거절했다. 도리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연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때는 공산주의에 심취한 모양이다.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다녔다.
그럼에도 레닌이나 스탈린을 흠모하지는 않았다. '버마의 고리키'라고 했다. 역시나 작가적 정체성이 강했던 것이다. 신실한 불자였기에 과학적 유물론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은 '사회주의자'로 낙찰이 되었다. 우누는 '불교 사회주의자'였다. 총리로서 좋은 업(Karma)을 짓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미얀마를 '불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불교에 바탕을 두고 사회주의를 접목시키려 했다. 미얀마의 장래로 표방한 피다우타(Pyidawtha) 또한 낙토 혹은 정토로 풀 수 있는 개념이다. 정갈한 땅이자, 즐거운 땅이다. 산업 국가보다는 농업 사회주의, 불교 경제를 지향했다.
실제로 1950년대 불교 중흥이 역력했다. 식민지 시기 사라졌던 사찰들과 불교 학교(Sangha)들이 대거 부활했다. 일국주의에 그치지도 않았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대규모 국제 불교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부터 라오스까지 수많은 승려와 불교학자들이 회합했다. 세계 3대 불교 성지의 하나로 꼽히는 파간의 위상을 십분 활용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동남아를 잇는 인드라망의 허브였다. 불교를 공유하는 문명적 공속감으로 탈식민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다스렸다. 불살생과 비폭력의 불교 사상은 국제 정치로도 번안되었다. '비동맹'이 그것이다. 미얀마는 소련의 위성국 되기를 거부하고 비동맹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비동맹운동을 대내적으로는 불교 중흥에 역점을 두었지만, 실제로 양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우누보다는 네윈이었다. 최대의 안보 위협이 된 국민당 잔군을 축출해야 했고, 공산당과 소수 민족의 봉기도 진압해야 했다. 버마공산당도 한국 전쟁 발발을 기회로 여겼다.
조선노동당이 남진하자 버마공산당도 남하했다.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요청한 것도 판박이였다. 이 안팎의 냉전/내전 속에서 네윈은 불교 사회주의가 한가한 타령이라고 여겼다. 청년 장교들을 주축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다.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 군부 내 사조직이었다. 갈수록 이들에게 힘이 쏠렸다. '불교 사회주의'를 대체한 '버마식 사회주의'가 공식화된 것이 1962년이다.
우탄트(U Thant)
우누가 총리가 되고 각별히 도움을 청한 이가 우탄트였다. 우탄트는 학생 운동의 막후 브레인이었다. 1930~40년대 양곤 대학 기관지를 비롯해 주요 문건을 전담하다시피 집필했다. 아웅산이 현실주의자, 우누가 낭만주의자라면, 우탄트는 실용주의자에 빗댈 수 있는 인물이다. 집안 배경이 특별하다. 중국계와 인도계, 이슬람계가 섞였다. 태생부터 세계인, 지구 시민이었다.
우누의 비동맹 노선을 완성시킨 것도 우탄트였다. 1950년대 미얀마는 외교 강국이었다. 1954년 한해에만 국제 불교 회의와 콜롬보 회의를 동시에 성사시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실론(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콜롬보 회의는 이듬해 반둥 회의의 디딤돌이었다, 반둥 회의의 사무총장 역시 우탄트였다.
대외적으로는 네루, 나세르, 저우언라이, 수카르노가 주목받았지만 막후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우탄트였다. 실제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들 가운데 우누와 우탄트가 있었다. 자금성에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는 베트남에 들려 하노이에서 호치민도 만났다.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도 미얀마였다.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한 유태인들을 안타까이 여겼다. 이스라엘의 좌파 세력에도 호감을 품었다. 그들의 '유대교 사회주의'가 미얀마의 '불교 사회주의'와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여겼다.
영-미와 소련도 방문했다. 런던에서는 여든의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그는 미얀마 왕국을 전복시켰던 랜돌프 처칠의 아들이다. 묵은 감정은 털어내자며 위스키로 건배했다. 피식민국의 우누와 우탄트가 식민 모국에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다. 모스크바에서는 니키타 후르시초프를 만났다.
사회주의에는 우호적이되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계서제에는 거리를 두었다. 소련의 속국이 된 동유럽에 동정을 품었다. 미국도 빼놓지 않았다. 말론 브란도가 오스카 상을 받고,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던 시절에 미국을 둘러보았다. 그럼에도 미국식 소비 문화에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욕망의 절제를 가르치지 않는 '아메리칸 드림'에 혀를 내둘렀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망라한 이 지구적 행보에 전략을 짜고 대화를 조율하고 연설문을 쓰고 언론과 소통했던 이가 바로 우탄트였다. 그 발군의 능력을 인정받아 1957년에는 유엔(UN)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만장일치로 제3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다. 우누의 조언자이자 조력자에서 세계 평화의 기획자로 승진한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스라엘-아랍 전쟁 등 냉전기 주요 사건들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 임기 말에는 베트남 전쟁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줄담배를 피우다 암까지 생겼다. 사상은 없고 처세에만 능한 훗날의 아시아 출신 유엔 사무총장과는 격이 달랐던 것이다. 미얀마의 전통에 서구식 교양까지 겸비한 현대판 보살이었다.

▲ 우탄트. ⓒwikipedia.org
민동(Mindon)
미얀마 총선을 지켜본 지 4개월이 더 지났다. 수치의 최측근이 대통령이 될 모양이다. 그녀는 외교부 장관을 맡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위태위태하다.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다. 아마추어 정부이다. 현실적으로 군부-관료에 기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수치가 '계몽 군부'의 얼굴 마담인지 모른다.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수치의 글들을 읽어보았다. 감흥이 없었다. 심드렁했다. 구태여 미얀마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역사와 유리된 진공의 언어이다. 사론이 결여된 이론 신앙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백성사만으로는 더 이상 식상함을 피하기 힘들다.
미얀마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더 메이킹 오프 모던 버마(The Making of Modern Burma)>였다. 저자가 우탄트 민트(U Thant Myint)이다. 우탄트의 손자이다. 피는 못 속인다. 안목이 빼어나다. 글 솜씨도 뛰어나다. 1850년대 미얀마의 마지막 황제 민동의 개혁 정책을 꼼꼼하게 되살핀다.
메이지 유신에 못지않은 대대적인 개혁이었다. 교토에서 도쿄로의 천도에 빗댈 만큼 만달레이를 새 왕조의 수도로 개조했다. 미얀마의 근대를 담보하는 '신도시'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중국식 관료제를 도입하여 신진 엘리트를 양성하고, 영국식 군사 제도를 모방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산업 혁명도 시찰했다. 문무 제도를 정비하여 불교 국가의 근대화, 개신(改新) 불교를 꽃피우고자 했다. 중국화와 서구화의 결합으로 동남아 최초의 대승(大乘)국가가 발진했던 것이다.
민동 본인부터 솔선수범했다. 轉輪聖王(전륜성왕, Cakravartiraajan), 즉 불교적 성군이 되고자 분발했다. 정법(正法, Dharma)으로 지상을 다스리는 달마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남유라시아 불교 세계의 역할모델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국제 불교 대회를 처음 주최한 것도 민동이었다. 1954년 열린 국제 불교 대회는 '제6회'라고 표기되었다. 우누의 '불교 사회주의'란 민동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영제국으로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려 한 것이다. 언뜻 1950년대 '미얀마의 봄'은 1850년대 미얀마의 만개인 듯 보였다.
실제로 1850~60년대는 미얀마 왕조의 절정기였다. 마치 베트남이 민망 황제 아래 대남제국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미얀마 또한 전성기에 직면하여 영국의 침략을 겪은 것이다. 역시 만만치가 않았다. 세 차례의 정복 전쟁 끝에야 식민지가 되었다. 그만큼 내부 역량이 탄탄했던 것이다.

▲ 만달레이에 있는 민동 황제의 동상. ⓒ이병한
메이지 일본과의 차이라면 지리가 숙명이었다. 인도를 삼킨 영국이 지척에 자리했다. 영국산 무기에 인도인 용병을 합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봉건적이어서, 후진적이어서, 정체되어서, 개혁이 모자라서 패한 것이 아니다. 대영제국의 군사력에 굴복했던 것이다.
두 세대에 걸친 식민 통치로 미얀마의 전통적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는 무너졌다. 콜카타에 근거지를 둔 영국 총독의 군대와 경찰, 사법 제도가 이식되었다. 기층 사회와 유리된 상층부였다. 제도와 문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 식민지 통치 기구마저도 일본과 영국의 혈투 속에서 붕괴되었다.
전통의 근대화에도 실패하고, 식민지 근대화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폐허 속에서 제도적 공백을 채워간 것이 네윈의 군사 정부였다. 나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옹호할 뜻이 조금도 없다. 다만 한없이 딱할 뿐이다. 가엾고 안타깝다. 20세기 제3세계의 비극을 미얀마식으로 변주했던 것이다.
부디 수치가 1950년대 '미얀마의 봄'을 복기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합의했던 연방제 국가와 우누의 불교 사회주의와 우탄트의 비동맹노선을 곰곰이 곱씹어보기를 권한다. 나아가 19세기 민동의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 불교적 계몽주의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다른 문명화, 다른 근대화의 맹아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 출발하는 미얀마 또한 '다른 백 년'의 든든한 동반자이기를 바란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따져 봐도 그녀의 삶과 사상은 영국 산이다. 새 시대를 여는 맏딸이기보다는 구시대의 막내이기 십상이다. 나로서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의 '민주화 세대'에 기대를 걸게 된다. 2048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얀마의 주역이 될 이들이다. 재차 지리가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천년 중국은 중화 문명의 중흥을 설파한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Hindutva, 힌두뜨와) 건설이 한창이다. 20세기형 진보를 대체하는 문명 복고, 재활과 부활의 흐름이 뚜렷하다. 인도와 중국, 양대 문명 대국 사이에 자리한 미얀마의 향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 미래를 미리 접해보고자 양곤 대학을 방문했다. 각 나라의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구내 서점을 살펴보고 학생 식당에서 한 끼를 때우는 것이 내 나름의 의례이다. 그런데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다. 외국인의 출입을 금한단다. 교문만 서성이다 황망하게 돌아섰다. 가야할 길이 꽤나 먼듯하다.
[유라시아 견문] 모디 : 인도의 재발견
모디, 21세기 간디 혹은 인도의 히틀러?
2014년 체제
획기적인 선거였다. 정초(定礎) 선거였다. 인도 현대사는 2014년 5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21세기의 인도가 발진했다. 그 주인공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이다.
인도의 총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선거이다. 유권자만 8억 명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은 5억5000만 명이었다. 유럽 총 인구가 5억 명이다. 남북아메리카를 합해야 6억5000만 명이다. 유럽보다 더 많고 아메리카 대륙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가 인도 총선에 참여한 것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절반이 인도에 산다. 그 인도인들이 모디를 선택했다.
3억 명 가까이가 인도인민당(BJP)을 지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은 중국공산당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은 인도인민당이다.
모디는 총선을 대통령 선거처럼 이끌었다. 모디냐, 아니냐를 묻는 구도로 몰고 갔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압승을 이끌었다. 하원(Lok Sabha) 543석 가운데 282석을 휩쓸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은 1984년 이래 처음이었다.
1984년보다는 1952년, 제1대 총선에 빗댈 만하다. 네루가 이끄는 국민회의가 압승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국민회의의 적수가 없었다. 그 후 일당 우위 체제가 오래 지속되었다. 간디와 네루의 이름값으로 지속되는 유사 왕조가 인도의 20세기를 지배한 것이다. 네루의 딸로 총리가 된 인디라 간디는 "짐이 곧 국가(Indira is India)"라고 말한 적도 있다.
2014년 모디의 맞은편에 섰던 이도 라훌 간디였다. 네루의 증손자가 국민회의의 수장이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자 가장 오래 집권했던 국민회의는 추락했다. 추락보다 몰락이 더 어울린다. 44석을 얻는데 그쳤다. 사상 최악의 결과였다. 지방 정당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남인도 타밀 나두 주를 대표하는 정당이 37석이었다. 한 석도 얻지 못한 주가 태반이다. 수도 델리에서도 전패했다. 당의 존립 여부가 의문시되는 지경이다. 20세기가 극적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1952년 체제'를 마감하고, '2014년 체제'가 출범했다.
이 선거 혁명을 주도한 이가 21세기의 신청년들이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1억 명에 육박했다. 건국 70여 년, 인도는 '젊은 국가'이다. 청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들이 대거 모디를 선택했다. 국민회의와 더불어 좌파 정당도 몰락했다. 서벵갈 주과 케랄라 주에서 장기 집권했던 인도공산당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새 유권자들은 20세기형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
국민회의의 자충수도 없지 않았다. 모디의 비천한 출신을 공격했다. 기차에서 짜이나 팔던 소년 시절을 부각시켰다. 모디는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국민회의 없는 인도를 만들자!"고 선동했다. 청년들이 표로 심판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내부자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를 선택했다. 간디와 네루의 명문가 자제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개인을 선택했다. 모디 물결(Modi Wave)이 인도를 휩쓸었다. 신/구간의 대반전이었다.
모디는 기인이다. 완전한 채식주의자이다. 달걀도 먹지 않는다. 금욕주의자이기도 하다. 독신을 고수한다. 유흥과 잡기를 즐기지도 않는다.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잔다. 휴일도 휴가도 없다. 자투리 시간에는 요가와 명상을 한다. 일하는 시간을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란다. 요기이고 구루이다. '신자유주의적 성자'이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렇게 연출한다.
소셜 미디어도 능숙하게 활용한다.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IT(정보 기술)에 힌두 문명을 결합시켰다. 흡사 '디지털 구루'처럼 보인다. 대중 연설 또한 탁월하다. 여느 정치가와는 다르다. 종교 행사 같다. 수많은 현자와 성자를 인용한다.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같은 고전부터 20세기의 스와미 비베카난다(1863~1902년)와 마하트마 간디(1869~1944년)까지 종횡무진 한다.
그래서 열광을 자아내기보다는 경외를 일으킨다. 그의 연설장에는 산문적 열정이 분출하다가도 시적인 고요가 흐른다. 세속적 정치인에 영적인 지도자를 겸비한 것 같다. 역시나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지지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 여야의 교체가 아니라 사상의 교체, 정권 교체보다는 시대 교체로 읽히는 까닭이다.
당선 이후 첫 번째 독립기념일 행사가 상징적이다. 무굴 제국의 황궁, 레드 포트 앞에 섰다. 머리에는 주황색과 녹색이 섞인 터번을 둘렀다. 몸에는 하얀색 장의(長衣)를 걸쳤다. 영어는 한 마디도 쓰지 않았다. 오로지 힌디어로만 한 시간이 넘는 연설을 대본 없이 소화했다. 그의 연설을 듣고자 델리의 교통지옥을 뚫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그 현장을 TV와 인터넷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모디는 단독으로 네루-간디 왕조를 종식시킨 첫 번째 지도자이다. 가난한 하층 카스트 출신으로 국가수반 자리에 오른 첫 번째 인물이다. 1950년생, 인도가 독립한 이후 태어난 첫 세대 지도자이다. 인도의 정체성이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다른 백 년'의 초입에 들어섰다.

▲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publicbroadcasting.net
인도의 발견
국민회의는 대영제국의 산물이다. 1885년에 결성되었다. 초장부터 영국풍이 여실했다. 영국 유학 출신 법률가, 언론인, 관료들이 중심이었다. 초대 의장 앨런 흄(A. O. Hume)은 인도에 사는 영국인이었다. 영어 교육을 받은 엘리트 브라만과 자유주의적 영국 지식인들이 조직한 합작 기구였다. 총독부와도 막역했다.
1910년대 국민회의의 정치화를 촉발시킨 이가 애니 베샌트(Annie Besant) 여사이다. 아일랜드 인이었다. 1917년 콜카타 대회에서 국민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녀는 인도를 아일랜드처럼 여겼다. 인도의 정치적 발전도 사회적 진보도 대영제국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녀가 출범시킨 전인도 자치 요구 연맹(All-India Home Rule League)도 아일랜드의 자치 운동을 인도에 이식한 것이었다.
즉, 국민회의(Congress Party)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의회(Congress)를 통한 자치였다. 영국식 교양을 몸에 익힌 인도 엘리트들의 정치 참여를 요청한 것이지,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Independence)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파가 아니라 개량파였다. 중국의 국민당(Nationalist Party)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했다.
변화의 계기는 간디의 귀국이었다. 간디도 1888년, 19살 나이에 고향 구자라트를 떠나 영국에서 유학했다. 1915년에 귀국했으니 근 30년을 해외에서 생활한 셈이다. 특히 남아프리카 체험이 중요했다. 그곳에서 대영제국의 자유주의에 내재한 인종주의를 사무치게 경험한다. '영국 신사'를 흉내 내던 신청년이 '마하트마 간디'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귀국할 무렵에는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사리 차림이었다. 변호사가 아니라 성자를 연출했다. 자치운동 또한 'Home Rule'에서 스와라지(Swaraj)로 전환시켰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풍 사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간디는 국민회의와 대중운동도 결합시키려 했다. 국민회의의 거점은 콜카타(캘커타), 뭄바이(봄베이), 첸나이(마드라스)등 연안의 식민 도시였다. 이곳에서 국민회의의 주축을 이루는 근대적 지식인들이 배양되었다.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부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까지, 영국의 정통 사상을 흡수하며 성장했다. 식민 통치를 대리 수행하는 고급 엘리트, '갈색 영국인'이었다. 이들은 인도의 일반 대중들은 알아먹기 힘든 말을 썼다. 갈수록 기층과 유리되어 갔다.
이 연안 도시들의 외부, 인도의 아대륙으로는 광활한 토착 세계, 민중 세계가 펼쳐졌다. 힌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여전했다. 간디는 이 신/구 사이의 분단 체제를 메우고자 했다. 근대적인 법률 용어나 정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스와라지와 아힘사(비폭력) 등 종교적이고 토착적인 고유어로 소통했다. 소금 행진 등 민중과 더불어 불복종 직접 행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회의식 의회 투쟁은 일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간디가 암살됨으로써 고금합작 노선은 단절되고 말았다.
독립 인도의 주역은 단연 네루였다. 카슈미르 주 브라만 출신인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포함해 영국에서만 8년을 공부했다. 네루의 사회주의 또한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계승한 것이었다. 네루 본인도 말년에 스스로를 "인도를 다스린 마지막 영국인"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국민회의에 도전했던 인도공산당 또한 영국 유학파들이 다수였다. 토착파 마오쩌둥이 장악한 중국공산당과는 판이했다. 소련과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한 마오와는 달리 인도공산당은 고분했다. 모스크바와 런던의 자장 아래 있는 이중적 종속성을 연출했다. 인도국민회의는 영국 같은 나라를, 인도공산당은 소련 같은 나라를 염원했다.
네루는 종종 간디를 "중세 가톨릭 신자" 같다며 불평했다. 힌두교 마을을 만들자며 물레를 굴리는 간디에 눈살을 찌푸렸다. 네루는 중공업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근대 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세속주의를 헌법으로 못 박기도 했다. 그가 집필한 대저 <인도의 발견>을 읽노라면 힌두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쇠퇴를 자명한 것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종교의 종언과 과학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성이 영성을 대신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래서 소련처럼 종교를 탄압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자연스레 소멸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다로 돌아가자는 힌두교도와 이슬람 신정을 주장하는 무슬림을 애석하게 여겼다. 과거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시간은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네루는 역사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는 근대의 신도이고 사도였다.
외부에서는 인도를 조금 다르게 보았다. 구좌파들은 네루식 사회주의와 비동맹 외교에 호감을 품었다. 네루가 '발견'했다는 부락 마을과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일부는 케랄라와 서벵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산당 지방 정권에 희망을 투사하기도 했다.
반면 신좌파들은 서구의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오리엔트의 정신주의의 메카로서 인도를 주목했다. 히피들의 유토피아로 인도가 호명되었다. 비틀즈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영성에 목마른 이들이 인도를 찾았다. 그들이 '발견'한 인도는 역설적으로 진보가 말소된 무역사적, 초역사적 공간이었다. 영국 총독부가 구축한 '고대 인도'의 신성한 이미지가 68 혁명의 전위(counter-culture)와 디지털 문명의 첨단(cyber-culture)에서 고스란히 복제되었다.

▲ 인도 공화국의 날(뭄바이). ⓒ이병한
친밀한 적
인도의 주요 제도들은 1947년 독립하면서 돌연 출현한 것이 아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해 온 것이다. 분기점은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1858년이다. 1857년 세포이 대항쟁(혹은 제1차 인도 독립 전쟁)을 계기로 동인도회사에서 영국으로 통치권이 옮아갔다. 1858년 인도 통치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인도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앙 집권적 지배 아래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영제국의 전신 무굴 제국은 '소왕국 연합체'에 가까웠다. 중화 제국처럼 말단까지 단일 언어(한문), 단일 사상(유학)으로 통치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다. 주마다, 마을마다 고도의 자치를 누렸다. 델리에는 술탄이 자리했지만, 소왕국들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힌두 왕이었다. 대영제국이 구축한 철도와 우편, 전화와 신문 연결망을 통하여 인도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인도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었다. 변화의 기폭제는 전쟁이었다. 유럽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이 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라시아는 공진화했다. 영국 본토에서 노동자, 여성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어가듯 식민지 인도에서도 정치 참여의 기회가 열려갔다. 본국에서도, 식민지에서도 총력전에 동원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민의 국민화'가 제국과 식민지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델리의 중심가에는 인디아 게이트가 우뚝하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여한 인도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희생의 소산이 1919년에 제출된 두 번째 인도 통치법이다. 행정을 중앙과 주로 분리했다. 주에서는 제한 선거를 도입했다. 인도인 엘리트들에게 지방 행정을 맡기기 시작했다. 중앙과 지방의 양두(dyarchy) 정치가 도입됨으로써 인도인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인 1935년, 다시 한 번 인도 통치법이 개정된다. 이번에는 중앙에서도 제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영국식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인도에 이양되었다.
독립 이후 건국 헌법은 1950년 1월에 발포되었다. 인도는 이날을 '공화국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한다. 올해 행사는 뭄바이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공휴일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든 제헌절과는 꽤나 다른 풍경이었다. 헌데 그 헌법의 8할이 1935년 인도 통치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경로 의존성, '식민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인도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즉 '탈식민'보다는 '후기 식민'이론이 등장한 배경이라고 하겠다. 이 역설적 상황을 "친밀한 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독립 이후 인도에서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식민지 제도를 크게 변경치 않고 계승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급진적 개혁 또한 실행하지 않았다. 국민회의의 주요 구성원들이 식민지 시대부터 대두한 중앙의 중간층 및 지방의 농촌 지주 및 부농층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에는 의회제 민주주의가 안성맞춤이었다. 의회 정치야말로 제3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던 급진적 혁명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편이었다. 친영파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도는 전후 신생 국가의 핵심 과제였던 토지 개혁에 실패했다. 토지 개혁이 단행되지 못함으로써 기층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도 지속되었다. 즉, 신분제에서 민주제로 이행한 것이 아니다. 상층부의 민주제와 하층부의 신분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다. 그 이중적 사회 구조 아래서 도시에서는 정부 주도의 중공업화 정책인 '사회주의'가 관철되었고, 농촌에서는 '봉건주의'가 역할을 분담했다.

▲ 인디아 게이트(델리). ⓒ이병한
인도의 재발견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1989년), 인도에서는 국민회의가 처음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다. '전후 체제의 탈각'이 본격화되었다.
국민회의 지도부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영미에서 유학을 한 특권층이었다. 토착파의 근거지는 힌두 사원이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며 근대화라는 거대 서사를 추진해갔던 국민회의와 달리 가정과 마을, 일상은 여전히 종교적 리듬으로 영위되고 있었다. 탈냉전에 진입하자 政派(정파)보다는 宗派(종파)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소련이 해체되던 해(1991년), 인도는 경제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많아졌다. 흥미로운 역설과 조우한다. 힌두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印橋(인교)들과 접한 것이다. 정작 해외의 인도인들은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IT 혁명의 근거지 실리콘밸리에도 힌두 사원이 여럿이었다. 히피와 힌디가 어울렸다. 마치 중국이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을 때 화교들이 중화 문명을 고수했던 풍경과 유사했다. '문화중국'을 가장 먼저 주창한 이도 '보스턴의 유림' 뚜웨이밍이었다. 인도 또한 재발견(rediscovery)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힌두 문명이 복권(recovery)되기 시작했다. 흡사 20세기의 보수주의가 21세기의 급진주의로 반전하는 모양새였다. 본토에서도 '힌두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인도인민당(BJP)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2014년 총선에서 모디와 BJP에 투표한 인도인들이 모두 힌두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구체제를 상징하는 국민회의를 심판하고자 했다. 더 많은 경제 성장과 더 나은 정부를 원했다. 모디가 주지사를 역임했던 구자라트 주는 '인도의 광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적으로 가장 활력 있는 주가 되었다. 모디 개인에 대한 팬덤도 무시할 수 없다. 힌두뜨와(Hindutva)라는 말을 비틀어 모디뜨와(Moditva)라는 유행어까지 생겼다.
그럼에도 힌두 민족주의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다. 모디 자신부터 세속주의(secularism)를 '수입된 개념'이라고 말한다. 聖(성)과 俗(속),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보편적인 근대화인가 회의를 표하고 있다. 유럽의 세속화를 인도에서도 관철해야하는가 질문하고 있다.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것과 인도가 힌두 국가라는 것이 상치되는 원리인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청년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secular를 'sickular'로, 'democracy'를 'demoncracy'로 비꼰다. '근대 인도'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독립 이래 인도에서 지금처럼 정체성 논쟁이 치열한 적이 없었다. 흡사 100년 전 중화민국에서 전개되었던 '동서 문화 논전'을 연상시킨다.
인도인민당(BJP)은 민족봉사단(RSS)의 하위 단체이다. RSS가 창립된 것은 1925년이고, BJP가 창당한 것은 1951년이다. 500만 명의 조직원을 자랑하는 RSS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단체이다.
모디의 권력 기반이기도 하다. 아니 모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디가 RSS의 마을 모임에 처음 나간 것이 8살 때라고 한다. 소년 단원이었다. 그 후 RSS는 그의 삶의 지표이자 나침반이 되었다. 간곡히 결혼을 권하는 부모의 뜻을 어기고 17살에 집을 떠났다. 히말라야부터 인도양까지 아대륙을 방랑했다. 해가 뜨는 벵골 만부터 해가 지는 아라비아 해까지 주유했다.
35년 후 구자라트 주지사가 되면서 얻은 사옥이 그가 평생 가진 첫 번째 집이었다. 그 만큼이나 RSS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파시스트 조직이라며 쏘아보는 눈길이 적지 않다. 사연이 깊고 복잡하다. 간디를 암살했던 힌두교도 나투람 고드세가 바로 RSS 소속이었다.
인도는 대국이다. 13억, 세계 2위의 인구이다.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이다. 중국을 앞질렀다. GDP로는 세계 7위, 실질 구매력으로는 G2 미국과 중국을 이어 세계 3위이다.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이면 인구는 첫째, 경제는 둘째가 될 전망이다. 더 이상 물질적 가난과 정신적 풍요라는 상투적 이미지가 통용되지 않는다.
인도 체류 5개월,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Standup India", "Clean India" 등 각종 구호가 요란하다. 세계사의 주역이라는 자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다. 규모에 걸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소명도 강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힌두교 국가라는 정체성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힌두화가 공존한다.
중국만큼이나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 중심에 BJP와 RSS가 자리한다.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다.
[유라시아 견문] 구자라트 : RSS와 BJP
기차가 불타자, 2000명이 죽고 400명이 강간당했다
구자라트
인도 아메다바드(Ahmedabad)에 내렸다. 구자라트의 주도이다. 인도 같지가 않다. 깔끔하다, 깨끗하다고는 못하겠다. 덜 더럽다. 덜 지저분하다. 길바닥에 너부러져 자고 있는 개들이 보이지 않는다. 파리 떼도 덜한 편이다. 팔다리를 잡아끌며 구걸하는 이들도 드물다. 공기도 덜 탁하다.
델리는 매연이 무척 심하다. 베이징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좀처럼 비도 내리지 않는다. 나뭇잎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다. 회색이 녹색을 덮는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머리칼이 빳빳해질 정도이다.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즐길 수가 없다. 취미 생활을 유보 당했다. 반면 아메다바드는 아라비아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청량했다. 바지런히 쏘다녔다.
도시 풍경도 사뭇 다르다. 영국풍 식민지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대영제국 시기 정치 경제적 중심지가 아니었다. 무미건조한 잿빛 콘크리트, 네루 시대의 소비에트식 모더니즘이 기저를 이룬다. 그 사이로 투명한 유리창이 빛나는 포스트모던형 고층 건물이 솟아나고 있다. 하이테크 스마트 빌딩들이 경쟁적으로 마천루를 이룬다. 20세기 인도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난 곳이 이곳 구자라트였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견주는 이도 있다. 적당한 비유가 아닌 것 같다. 규모가 다르다. 도시 국가가 아니다. 구자라트는 인도 인구의 4%를 차지한다. 5000만 명의 준(準)국가이다. 이 구자라트를 2002년부터 다스린 이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였다. '작은 정부, 많은 거버넌스(Less Government, More Governance)'를 내세웠다.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자랑했다. 인도 평균 7%를 훌쩍 앞지른다. 같은 시기 인도에서 생겨난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구자라트에서 창출되었다고 한다. 절대 빈곤 감소도 으뜸이었다. 10년 만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주가 되었다. 4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구자라트 모델'이 널리 칭송되었다.
순전히 모디 개인의 수완만은 아니다. 역사의 유산이고, 지리의 소산이다. 초기 근대(early modern)가 만개(full modern)했다. 지도를 보았으면 좋겠다. 구자라트는 인도양으로 툭 삐져나왔다. 긴 해안선을 보유한다. 아라비아 해 건너 오만이 남인도나 동인도보다 더 가깝다. 예로부터 인도양 경제권의 신경망이었다. 바닷길의 중간 역이었다.
자연스레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유능한 항해사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들이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을 엮었다. 동서 인도양 무역의 가교였다. 레바논에서 온 배와 중국에서 내려온 정크선이 이곳에 함께 정박했다. 아라비아의 카펫이 동남아까지, 중국의 도자기가 아프리카까지 전해졌다.
구자라트 상인들은 이 중계 무역을 통하여 양쪽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했다. 대영제국 시절에도 그 기질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제국의 연결망을 타고 중동과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곳곳에 진출했다. 마하트마 간디가 변호사 경력을 처음 시작한 곳이 남아프리카였음도 구자라트 출신이라는 점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인도양을 하나의 생활세계로 여겼던 '토착적 세계인'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 '거대한 뿌리'는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꽃을 피운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동서부로도 진출했다. 실리콘밸리와 맨해튼에 사는 인도인의 40%가 구자라트 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싶지만, 그만큼 해외 진출이 많다고 하겠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아메리카까지,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지구-지역망(glo-cal network)을 만들어 간다.
이 '글로벌 구자라트 인'들의 고향 투자에 힘입어 아베다바드는 금융 중심 첨단 도시로 변모 중이다. 면적은 런던의 금융가보다 두 배가 더 크다. 장차 유라시아에서 자웅을 겨룰만한 도시는 상하이가 유일하지 싶다. 인도형 지구화의 근거지이다.
다시 한 번 지도를 보자. 구자라트는 아라비아 해만 면한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 내륙과도 접한다. 이슬람 문명과의 경계지, 혹은 접촉면이다. 이슬람이 동진하면서 가장 먼저 이른 곳이 구자라트였다. 지금도 1억5000만 무슬림의 다수는 펀자브부터 서벵갈까지 북인도에 자리한다. 규모로 따지면 인도네시아(2억5000만), 파키스탄(2억)에 이어 세 번째이다. 중국과의 차이라고도 하겠다. 11억 힌두에 비하면 1할에 불과할지라도, 도무지 '소수 민족', '소수 종파'라고만 하기가 힘들다. 역시나 무슬림은 20세기에도 인도사의 주요 행위자였다. 정파(이념)가 아니라 종파(종교)로 갈라섰던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를 촉발시켰다.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떨어져나간 바로 그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넘어온 이들이 적지 않다. 피난민들은 반파키스탄, 반이슬람 정서가 강하다. 1000년 전 오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진격해온 투르크-페르시안 무슬림의 구자라트 정복 이야기가 민간 설화로 전해진다.
무굴제국에 대한 기억도 왜곡되었다. 종교 다원주의의 전범을 과시하며 '유라시아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제국의 관용성은 은근슬쩍 지운다. 무슬림의 힌두 지배라는 단순 구도로 이해한다. 9.11 이듬해, 구자라트에서도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다. 미국인들의 심층 심리에 9.11이 각인되어있듯, 인도인들에게는 '2002년'이 집합적 기억으로 남아있다.
Reaction
기차에서 말동무를 만났다.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이들이 많다. 서아시아인에 비해 동아시아인들이 많지 않아서일 것이다. 바다로 활짝 트인 서아시아와는 달리 동아시아는 히말라야를 건너야 한다. 한류 또한 '세계의 지붕'을 넘지는 못한 것 같다. "너 성룡 닮았다(You looks like Jackie Chan!)"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지하철에서도, 오토릭샤 기사도, 숙소 직원도 그렇게 말한다. 별로 닮지 않았다. 아마도 성룡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동아시아인인가보다. 홍콩에서 만든 무협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본 것도 아니다. 주로 할리우드에서 찍은 성룡 영화를 보았다. 구자라트로 가는 기차에서의 대화 또한 그렇게 시작되었다. 재키 챈 닮았다며, 사진을 찍자고 한다. 지난 5개월, 인도의 페이스북에 내 얼굴이 여럿 실렸을 것이다. 'Jackie Chan'이라는 태그를 달고.
그는 구자라트 출신의 부동산 사업가였다. 1970년생, 40대 중반이었다. 루이비통 가방에 버버리 구두를 신었다. 손에는 갤럭시 S7을 쥐었다. 더 많은 명품을 걸치고 있었을 터인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배낭 여행 다니던 대학생 시절이 아니다. 도무지 일반 칸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큼한 땀 냄새에 짐짝처럼 실려 갈 자신이 없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침실 칸을 탔더니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부류를 만난 셈이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등장한 소위 '신중간층'이다. 국민회의 시절 중간층은 영어 교육을 받고 관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었다. 부동산과 금융, IT, 문화 산업이 약진했다. 아비투스의 차이가 현저하다. 문화적 자긍심이 넘친다. '인도인'보다는 '힌두인'의 자부심을 표출한다. 라이프 스타일도 영미풍, 서구화 일변이 아니다. '브라만화' 하고 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주의와 일상의 금욕주의가 묘하게 섞여 있다. 명품으로 치장한 외양과는 달리 그 또한 육식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술도 입에 대지 않는다. 구자라트 주는 금주가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자니교의 영향이 짙기 때문이다. 간디도 유학가기 전, 고기를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고서야 가족의 허락을 구할 수 있었다. 정갈하고 청결한 삶을 신중간층의 상징 자본으로 여긴다.
그 역시 모디'빠'였다. 국민회의에 대한 반감이 몹시 심했다. 정실 정치와 부정부패에 넌덜머리를 냈다. 국민회의 일당 우위 체제 시절을 '정실 사회주의(crony socialism)'로 접근해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간디의 고향인 구자라트도 국민회의의 오랜 아성이었다. 반세기를 집권했다. 처음으로 정권을 교체한 이가 모디였다.
한참을 우회하다 뜸들이던 질문을 던졌다. 가장 궁금한 주제였던 "2002년"에 관한 것이었다. 델리로 이주한 지 10년째라니, 2002년에는 그도 구자라트에 살았을 것이다. 아차, 싶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색이 사라졌다. 나보다 더 오래 뜸을 들이더니 "Reaction"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고드라에서 기차가 불타지 않았다면, 폭동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화는 딱 거기까지였다. 뚝 끊어졌다. 어색해진 공기를 2시간이나 더 견뎌야 했다. 인도의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잦은 정전만큼 열차 또한 느릿하다. 창밖의 풍경 또한 천천히 변한다. 15년 전 기억도 생생하다. 살인의 추억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였다.
사건은 방화에서 시작되었다. 58명의 힌두교도들이 타고 있던 기차에 불이 났다. 아요디야(Ayodhya)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사연 많은 사원이다. 16세기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 본래는 힌두교 사원이었다. 이슬람이 진출하고 무굴제국이 세워지면서 힌두교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모스크를 지은 것이다.
힌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재차 허물고 힌두사원으로 복구시켰다. 망치와 해머로 모스크를 부시는 모습이 인도 전역에 중계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이후 힌두의 성지가 되었다. 라마 탄신을 기념하는 사원이라 했다. 무슬림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힌두교도들의 기차에 불을 지른 것이다.
마침 모디가 구라자트 주지사에 취임한 무렵이었다. 즉각 애도를 표시했다. 장례식도 열었다. 불에 탄 시신이 공개되었다. 그의 표현대로 'reaction'이 일어났다. 아메다바드를 비롯한 구자라트의 여러 도시에서 학살과 강간이 발생했다. 격분한 힌두들이 무슬림에 보복을 가했다. 2000여 명이 살해되었고, 400여 명이 강간당했다.
가옥 파괴로 약 20만 명은 난민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인도의 선거인 명부에는 종교와 카스트가 기재되어 있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소수 종파와 하층 카스트를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명단을 활용하여 무슬림 가정을 표적으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래서 효율적인 작전이었다. 무슬림이 소유한 상가들까지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주정부의 암묵적 승인 아래, 혹은 막후 지원으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까닭이다.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이들이 황색 스카프에 카키색 바지를 입었다고도 한다. 민족봉사단(RSS)의 유니폼과 일치한다. 막 주지사가 된 모디는 RSS의 골수 단원 출신이었다.
모디는 그 사건에 대해 오랜 침묵을 고수했다. 2013년 관련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서야 유감을 표시했다. 그 사이 그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오래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간디-네루 왕조에서 힌두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여겼다. 국민회의 시절 두 명의 대통령이 무슬림이었다. 인구 대비 무슬림의 의석수도 많은 편이었다. 세속주의라는 이름으로 힌두가 절대 다수인 국가에서 무슬림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모디는 무슬림을 우대하거나 편애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었다. 공정하고 공평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구자라트에서 종파 간 분쟁이나 폭력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빼어난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 철저한 금욕주의에 부패와는 일절 거리가 멀었다. 구자라트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힌두교의 내적인 가치와 결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20세기 국민회의식 '인도 민족주의'에 대한 21세기 '힌두 민족주의'의 리액션이었다.

▲ 구자라트 금융가. ⓒ이병한
민족봉사단(RSS)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는 1925년 결성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였다.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인도인 용병의 역할이 혁혁했다. 그런데 다수가 무슬림이었다. 영국의 분리 통치였다. 소수파인 무슬림과 시크교들을 경찰과 군대에 등용하여 다수파인 힌두를 다스렸다. 힌두교도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힌두의 땅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판을 친다며, 역차별과 불공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영국과 국민회의, 그리고 이슬람에 맞서 힌두의 대통합을 주장하는 RSS가 등장했다.
정치 단체는 아니었다. 정당도 아니었다. 사회봉사와 헌신을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자원봉사 단체에 가까웠다. 다만 철저하게 힌두교에 바탕을 두었다. 정신의 수양과 육신의 수련을 강조했다. 힌두의식을 양성하고 고무시켰다. 빛을 발한 것은 격동기였다. 영국이 떠나자 아대륙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쪼개졌다.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인도로 이주했고, 그만큼의 이슬람교도가 파키스탄으로 피난 갔다. 한반도의 남북 간 인구 이동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다. 북인도 일대는 거대한 아수라장이었다.
이때 피난을 돕고 난민촌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이들이 RSS 단원이었다. 세 차례의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도 RSS는 후방에서 맹활약했다. 중국과의 국경 전쟁을 치를 때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군인은 멀리 있지만, RSS 단원들은 곁에 있었다.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며, 잠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민심을 샀다.
조직원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말단 세포들이 마을마다 퍼져갔다. 불가촉천민 차별을 해결하고, 힌두교를 더욱 평등한 종교로 개혁하는데도 앞장섰다. 그 중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직에 헌신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수도승처럼 엄격한 규율과 훈육 속에서 생활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RSS의 탄생과 성장을 20세기 조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꼽고 있다. 허장성세만은 아닌 것 같다. 500만을 돌파하여 600만을 향해간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조직이다. 경쟁자라면 비슷한 시기 비슷한 활동으로 성장했던 무슬림 형제단이 있을 것이다.
RSS와 파시즘을 결부시키는 독법이 없지 않다. 전혀 허황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1940년대, 파시즘에 기운 적이 있다. 영국을 격파하는 독일을 주시했다. 독일로 말미암아 대영제국도 무너질 수 있다는 기대가 피어올랐다. 나치스의 인종적 순혈주의에도 솔깃했다. 인도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의 땅이라는 그들의 소망과 통한다고 여겼다.
영미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를 넘어서자는 히틀러의 선동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에 반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을 구걸하는 국민회의 노선은 굴욕적으로 보였다. 힌두사원에서 코란을 인용하며 무슬림과 힌두의 공존을 호소하는 간디 또한 불경하다고 여겼다. 힌두 문명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과격파였던 고드세의 총구가 끝내 간디를 겨냥했던 까닭이다.
초대 수상 네루는 건국 초기 3년간 RSS를 비합법 단체로 만들었다. 1970년대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RSS 활동을 금지시켰다. 당시 수배령을 피해 지하로 잠수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모디였다. RSS는 하방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기층으로 파고들었다. 국민회의와의 불화 또한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 내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국민회의 시절은 대영제국의 연장선, 그 후신에 불과했다.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도모했다.

▲ RSS 아침 조회. ⓒ이병한
인도인민당(BJP)
모디를 대처에 빗대는 이들이 있다. 혹은 푸틴에 견준다. 비유도 꼭 서방 사람들만 댄다. 내가 보기엔 1979년의 두 거인을 합한 것 같다. 동아시아의 덩샤오핑과 서아시아의 호메이니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이란의 종교 혁명을 결합시킨 것 같다. CEO형 리더이자 토착적 민족주의자이다. 차가운 경제적 합리성과 뜨거운 종교적 열정을 한 몸에 체현하고 있다. 덩샤오핑에게 1989년의 천안문 사태가 있다면, 모디에게는 2002년 아오디야 사태가 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reaction'을 촉발했다. 이란은 페르시아제국의 후예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위상이 상당하다. 종교 혁명의 파고가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분할 체제 하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로서도 무심할 수가 없었다.

ⓒwikipedia.org
도저히 국민회의에 나라를 맡겨둘 수가 없다고 여겼다. 이듬해(1980년)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창당한다. 1951년 설립된 인도대중연맹을 재편하여 정당으로 거듭났다. 인도식 '이데올로기의 종언'이었다. 좌/우파가 아니라 종파에 기반을 둔 정당이 부상한 것이다. 1990년대 냉전 체제가 와해되자 BJP는 대약진하기 시작했다.
창당 당시에는 상층 카스트가 주류였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인구의 15%에 그친다. 다수결로 작동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 의회 정치에 적응해야 했다.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주력 대상이 바로 '신중간층'이었다. 전통적 상층 카스트와 현대적 신중간층이 BJP의 중추를 이루었다.
이들이 견인하는 '힌두 민족주의'에 대중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힌두' 안에 계층과 계급, 젠더를 녹여냈다. 힌두로 대동단결하는 전략으로 영국산 국민회의와 소련풍 공산당은 물론이요 무슬림, 여성, 하층 카스트 등 '소수자 정치'를 추구해왔던 자유주의 좌파 정당들을 역전시켜갔다.
무엇보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크게 호응했다. 2030 세대들이 유권자의 4할을 점할 만큼 현재의 인도는 젊은 국가이다. 이들이 "인도를 정복하라, 좋을 날이 올 것이다(Conquest of India. Good days are ahead)"라는 모디의 트윗에 격하게 반응했다. 리트윗에 리트윗을 반복하며 그들 자신과 인도의 카르마를 바꾸기를 열렬히 염원했다. 따라서 2014년 총선은 좌파에서 우파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일반적인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시대교체, '다른 백년'의 출발이었다.
힌두 민족주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대세이다. 메카 트렌드이다. 국민회의마저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 더 이상 정교 분리만을 일방으로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 연설에서 힌두 고전을 인용하고 기후 변화의 대안으로 요가적 삶을 선전하며, '국제 요가의 날'까지 이끌어낸 모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장차 국민회의의 '탈영국화'와 '재인도화'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들에게도 유력한 자산이자 상징이 있다. 간디이다. 그간에는 그의 이름만 팔았지, 그의 사상을 따르지는 않았다. 1948년 간디 암살은 국민회의의 역사에도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간디는 국민회의와 민간 사회의 결합을 위해 분투했던 인물이다. 정치와 종교의 공진화, 성과 속의 습합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명저 <힌두 스와라지>는 인도의 전통 원리에 바탕을 둔 마을 만들기가 그의 건국 이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네루식 사회주의 세속 국가는 간디의 신념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국민회의 또한 탈세속화에 합류할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영성화의 물결이 역력하다. 근대 정치의 이념형으로부터 갈수록 벗어나고 있다. 인도식 정치, 힌두적 정치가 기지개를 켠다. 문명론이 국가론을 대체한다. 혹은 문명론과 국가론이 결합하여 근대적 정치이론을 갱신하고 있다. '다른 정치'이고 '새 정치'이다.
이제 <힌두뜨와(Hindutva)>를 살필 때가 되었다. 1923년에 출간된 책이다. 20세기의 전투적 힌두교 사상가 비니야크 다모다르 사바르카르의 작품이다. 얕지만 깊은 책이었다. 뜨거운 책이었다.
[유라시아 견문] <힌두뜨와> : 정치적 힌두교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군대에 입대하라!"
네루 대학교
델리에 입성한 것은 지난 2월이다. 학연 덕을 보았다. 단 두 번의 연결망이 필요했다. 학부 시절 인도사를 배웠던 이옥순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다. 지금은 인도연구원 원장이시다.
곧장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한 인도인 친구를 추천해 주신다. 사토시 쿠마르. 식민지 조선을 연구한다. 식민지 인도를 참조점으로 삼는다. 참신한 입각점이다. 나보다 나이도 어렸다. 이미 교수가 되었다. 최고 명문 네루 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네루 대학교 한국학과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학과이기도 하다. 그의 도움으로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연구실까지 덤으로 얻었다. 나아가 개인 교사 노릇도 해주었다. 인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어디서든 카톡으로 질문을 날렸다. 모교 선배인양 한껏 부려 먹었다.
때가 공교로웠다. 델리에 도착한 무렵부터 네루 대학교가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다. 두 달 이상 지속되었다. '네루대 사태'라 할 만했다. 정문에는 늘 카메라와 마이크로 중무장한 보도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CNN부터 알자지라까지 해외 언론도 주목했다. 뜻하지 않게 당대 인도의 핵심 문제로 곧장 진입할 수 있었다. 집권 2년차 인도인민당(BJP)의 모디 정부와 직결된 사건이었다.
사단은 2월 9일에 났다. 네루 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쿠마르(Kanhaiya Kumar)가 체포되었다. 아프잘 구루(Afzal Guru)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반국가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아프잘은 9.11 직후인 2001년 12월 13일 발생한 인도 의회 테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열 명이 죽었다. 파키스탄에 본거지를 둔 테러 단체의 지도자로, 카슈미르 출신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영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앙숙지간이다. 카슈미르는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모순이 응축된 핵심 장소이다.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보안법의 범주에 해당한다. 쿠마르는 아프잘을 기리며 반(反)인도적 언사를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형에 반대한다는 인도주의를 내세웠다. 도리어 인도인민당의 '힌두 국가 만들기'가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스마트 폰으로 녹화된 그의 연설은 SNS를 통해 널리널리 퍼져갔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네루 대학교에서는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다른 대학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남인도의 첸나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동인도의 콜카타 대학교에서는 좌/우파 학생들이 충돌했다. 좌파는 사상의 자유를 옹호했고, 우파는 매국적 사상을 규탄했다. 사태의 발원지인 네루 대학교에서는 교수들까지 힘을 보태었다. 학문의 자유를 옹호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릇된 민족주의에 저항한다 했다.
네루 대학교의 성격을 잠시 짚을 필요가 있다. 콜카타 대학교, 뭄바이 대학교, 델리 대학교 등 각 지역의 주요 대학과는 꽤나 다르다. 전자가 대영제국 시기에 들어선 식민지 대학의 후신이라면, 네루 대학교는 그 이름이 상징하듯 독립한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 대학이다. 196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만큼 독립 인도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 대학이기도 하다. 기초 과학 분야가 발달했고, 인문 사회 분야는 '진보적' 색채가 뚜렷하다. 인도 좌파들의 거점 같은 곳이다. 모두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다. 네루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 좌파 등 다양하다. 인도의 건국 헌법, 세속주의와 사회주의를 양대 축으로 삼는다.
학생 선발 방식도 남다르다. 성적 못지않게 다계층(카스트), 다언어, 다종교, 다지역, 다문명을 십분 고려한다. 소수 종파와 하층 카스트를 우대한다. 1947년 입안된 인도 민족주의, 즉 '시민적 민족주의'의 보루이다.
그러나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대학 밖에서는 '힌두 민족주의'의 물결이 도저하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심화될수록 침묵하던 다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근대적 가치가 아니라 힌두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도인민당의 등장 때문이다. 이번에도 네루 대학교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그치지 않았다.
지하철역에서 캠퍼스로 가고자 했던 한 네루 대학교 교수가 오토릭샤 기사에게 구타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소식에 나 또한 한동안 뙤약볕을 걸어 다녔다. 지레 겁을 먹었다. 낯선 환경이 공포심을 배가시켰다. 탓에 캠퍼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루 대학교 규탄 시위 현장도 지켜볼 수 있었다. 학생 시위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 미디어를 보아도 1:9의 비율로 네루 대학교에 대한 반감이 압도적으로 심했다.

▲ 석방된 네루 대학교 총학생회장 연설 장면. ⓒ이병한
네루 대학교와 인도인민당 간 갈등은 오래된 것이다. 1980년에 창당했으니, 30년을 넘는 세월이다. 네루 대학교야말로 반(反)힌두 국가의 허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급진 좌파라는 색깔론에 반(反)애국적이라는 마타도어를 보탠다. '힌두 민족주의'의 대척점에 네루 대학교를 놓는 것이다. '세속주의 인도'를 고수하는 세력의 마지막 근거지라고 한다. 그들이 보기에 세속주의, 즉 정교 분리란 인도의 이념이 아니다. 영국의 이념이다.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외세의 사상이다. 네루 대학교를 '내면화된 외세'의 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열흘을 캠퍼스 안에서 지내보았다. 네루 대학교가 자랑하는 한밤의 자유 강연과 노천 토론회도 직접 참여해 보았다. 예민한 감성과 드높은 이상으로 푸르른 20대 청년들과 말도 섞을 수 있었다.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대학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활력 넘치는 장소를 본 적이 드물다. 아카데미아의 이상이 살아 숨 쉬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마냥 찬탄하기에는 어딘가 모자랐다. 공허함이 없지 않았다. 모디 정부를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결합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의 주장에 흔쾌히 동의하기 힘들었다. 너무 나이브하다. 파시즘이라는 말도 지나치게 남발한다. 그래서 상투적이다. 표면만 살핀다. 마치 10여 년 전의 나를 보는듯했다.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사회주의 국제주의'에 부르르 떨던 시절이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하나의 이상을 공유하고 있음에 전율하던 때이다. 그런데 지금은 퍽이나 다르다. 각자의 문명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이론의 향연에 질색팔색한다. 뿌리가 약한 사상은 머지않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回心(회심)이 아니라 轉向(전향)이 번다한 까닭이다. 좌-우의 도식은 피상적인 허울이라고도 여긴다. 根本(근본)을 튼튼히 갖추었다면 좌도 우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놈 촘스키의 네루 대학교 지지 성명에 한참 고무되어 있던 그들에게 나는 사바르카르를, 오로빈도를 물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100년 전 힌두교 사상가들을 따져 묻는 이방인이 이상하다는 눈빛이었다. 따분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한국으로 치면 東學(동학)의 후신이라 할법한 대종교나 천도교, 원불교 사상가에 해당할 것이다.
역시나 그들의 텍스트는 첨단을 달렸다. 영국의 버소(Verso) 출판사에서 나온 슬라보예 지젝과 조르조 아감벤과 아룬다티 로이 등을 읊조렸다. (영어 중심의) 글로벌 공론장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구태여 인도까지 올 이유도 없었다. 나와 그들 사이에 단단한 벽을 확인했다. 新舊(신구) 사이의 아득한 분단 체제를 실감했다.
터벅터벅 숙소로 돌아와 이메일로 허한 마음을 나누었던 분이 경희대학교의 김상준 선생이다. 그 분이 일독을 권한 책이 바로 <힌두뜨와(Hindutva)>였다. 잠을 아껴가며 읽었다. 빠져들었다.

▲ 네루 대학교. ⓒ이병한

ⓒ이병한

ⓒ이병한
힌두뜨와(Hindutva)
힌두뜨와의 창시자는 사바르카르(Vinayak Damodar Savarkar)이다. 사상의 정립에 앞서 역사부터 재인식했다. 1907년, 독자적인 역사관을 제출한다. 1857년으로부터 반세기가 되는 해였다. 그는 1857년에 正名(정명)을 부여했다. 대영제국이 일컫는 '세포이 항쟁'이라는 이름을 버렸다. '제1차 인도 독립 전쟁'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단박에 그 의의를 격상시킨 것이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 독립한 최초의 국가, 미국 독립 전쟁을 의식했을 법하다. '인도 독립 전쟁'이라는 말도 의미심장하지만, '제1차'라는 수사는 더더욱 비상하다. 제2차, 제3차를 내다보는 예언가로서의 발언이다. 혹은 무장 독립 투쟁을 격려하는 선동가로서의 발언이다.
재차 1907년이라는 시점을 간과할 수 없겠다. 1905년 러일 전쟁이 있었다. 아시아의 일본이 유럽의 러시아를 격파시켰다.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그는 고무되었을 것이다. 국민회의의 출범 이후 사그라졌던 독립'혁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자 했다.
힌두뜨와는 힌두(Hindu)와 따뜨와(Tattva)의 합성어이다. 따뜨와란 본질, 원리 등을 뜻한다. 즉 힌두뜨와는 힌두 원리, 힌두성(性)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영어 문헌을 보면 힌두 민족주의 혹은 힌두 근본주의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 '힌두 지하드'라고까지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번역이 반역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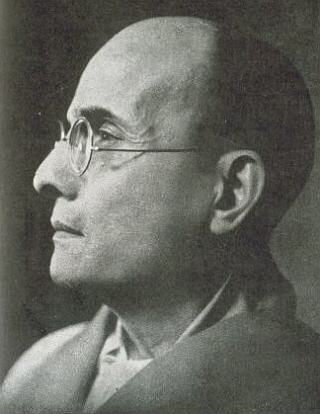
▲ 사바르카르. ⓒwikipedia.org
사바르카르는 힌두교에 헌신하는 종교 근본주의자가 아니었다. 종교 개혁파, '힌두교의 근대화'를 꾀한 인물이다. 설령 무슬림일지라도 그들이 태어난 이 땅을 소중히 여긴다면 힌두뜨와에 속할 수 있다며 배타하지 않았다.
그가 겨냥한 것은 유럽식 민족주의였다. 여러 이론가들이 있다. 어니스트 겔너, 앤서니 스미스, 에릭 홉스봄 등 다양하다. 종합 요약하면 근대 민족주의란 문명(종교)과의 단절을 통한 인위적인 공동체 의식 만들기이다. 국민 국가라는 인공적인 정치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응당 교회보다 학교가 강조된다.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아니라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으로 정체성을 개조시킨다.
아침마다 읽는 신문으로 형성되는 '상상된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에 기반을 둔 '문명적 정체성'보다 우위에 서는 체제이다. 그래서 세속주의, 즉 성과 속의 분리 운동이기도 했다. 사바르카르는 이러한 속성을 인도 독립 혁명이 따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유럽형 국민 국가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힌두형 문명 국가를 재건할 것을 도모했다.
유럽, 특히 식민 모국 영국만 겨냥했던 것도 아니다. 국민회의의 간디와도 대척점에 섰다. <힌두뜨와>(1923년)는 명백하게 그에 앞서 출판된 <힌두 스와라지>(1910년)에 도전한다. 간디는 결단코 무장 투쟁에 반대했다. 자치(home rule)의 핵심은 수양(self-rule)에 있다고 했다. 그 신념을 접기보다는 투옥과 단식을 선택했다.
사바르카르는 네루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간디가 시대착오라고 여겼다. 그들이 살아가던 20세기는 亂世(난세)였다. 남아시아 식으로 말하면 '아수라(Asura)장'이었다. 도(Dharma)가 실현되지 않는 아수라판에서는 다르마와 인드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 즉 영국과 적대해야 했다. 그래야 영적 진화(self-rule)도 가능한 治世(치세)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비폭력을 주장하며 감옥에 갈 것을 요구하는 간디에 맞서,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군대에 입대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특히 카스트의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의 尙武(상무) 정신을 강조했다. 동시대는 성자, 즉 브라만이 존경받는 태평성대가 아니다. 난세와 아수라는 무사와 전사들, 크샤트리아의 전성기이다. 간디와 같은 절대적 아힘사의 고수야말로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시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비폭력은 성스러움(saintliness)의 소산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insanity)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사바르카르가 보기에 근대 국가의 핵심은 군사 국가이며, 그 주체는 모름지기 군대였기 때문이다. 즉 그는 변호사 출신의 간디와 달리 영국의 정신 문명에 대한 콤플렉스가 적었다. 오히려 크샤트리아의 상무 정신을 계승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자고 했다. 그 실현태가 바로 민족봉사단(RSS)이다. 지금도 오로지 남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간디가 끊임없이 영국과 인도 사이에서 사고했다면, 사바르카르는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서 사고했음도 흥미로운 차이이다. 그는 동시대의 어떤 힌두교 사상가들보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힌두교에 부족한 점을 이슬람이 가지고 있다고도 여겼다. 성/속을 분리하지 않는 '근대적 이슬람' 사상에 심취했다.
특히 인도의 독립 혁명은 오스만제국의 해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동시대 터키를 개창한 케말 파샤의 실험을 주시하고 있었다. 터키는 오스만제국의 아랍 문화를 뿌리 뽑고 유럽식 세속주의로 기울었다. 그 결과 민족 간, 종족 간, 종교 간 핵분열을 초래했다. 유럽식 민족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가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지고 만 것이다. 만국이 만국에 투쟁하는 또 하나의 아수라장이었다.
독립 인도가 이런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겼다. 서둘러 민족과 종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군림했던 무굴제국의 역사적 유산을 비판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굴제국은 이슬람제국이었다. 그 제국적 관용성과 공공성을 힌두뜨와 역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를 이슬람과 적대하는 힌두 근본주의의 원조로만 간주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독이다. 오히려 이슬람의 유산을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힌두 문명을 갱신하고 경장하고자 했다. 즉 그의 힌두뜨와는 무굴제국이 구현했던 '인도-페르시아 문명의 근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교를 버린 정치 혁명이 아니라, 종교 혁명과 정치 혁명을 겸장하는 또 다른 근대 혁명이었다.
이 활활 타오르는 정치적 힌두교, 혹은 전투적 힌두교 문헌을 읽어가면서 나는 어쩐지 기시감이 일었다. 신채호였다. 단재의 글이 떠올랐다. 그 역시 '강도 일본'에 분개하여 조선의 역사를 재인식했던 바 있다. 我(아)와 非我(비아)의 투쟁이라는 독자적 독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평생을 투쟁 사관으로 시종하지 않았다.
말년에 득의의 경지에 오른다. 아와 비아의 투쟁을 '小我'(소아)와 '大我'(대아)의 투쟁으로 진화시키고 격상시켰다. 사상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한 것이다.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대아에 귀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기 사상을 유럽의 '무정부주의'에 빗대는 것 또한 심각한 오독이다. 민족과 국가보다 보편 문명을 더 높이 섬겼던 동아시아 특유의 기제에 재접속한 것이다. '대동 세계의 현대화'로 접근하는 편이 한층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신채호만큼이나 사바르카르의 이상 또한 실현되지 못했다. 초대 수상 네루는 철저한 세속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였다. 국민회의가 오래 집권했다. 사바르카르는 그 독립 인도에서 19년을 더 살았다. 발언권은 이미 사라졌다. 고드세가 간디를 암살하기 직전에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고 한다.
사바르카르는 고드세의 멘토였다. 다만 암살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인물 간의 사상적 연결만은 명백한 것이었다. 1948년 11월 8일, 장장 5시간이나 이어졌던 고드세의 법정 최종 진술은 그가 사바르카르의 제자였음을 잘 보여준다. 간디와 네루, 국민회의 비판에서 판박이의 내용이었다.
1950년 1월 26일 인도공화국 출범(헌법 선포) 하루 전, 사바르카르는 짤막한 성명서 하나를 발표한다. 공인으로서 마지막 역할이었다. 여전히 인도 헌법에 명시된 세속주의를 비판했다. 영국식 정치가 독립된 인도에서도 지속됨을 통탄했다. 영성이 부재한 정치가 인도에서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숨을 거둔다.
그의 <힌두뜨와>가 21세기에 와서야 인도의 영감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몽상가로서 끝났던 그의 삶이 예언가로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힌두협회(VHP), 민족봉사단(RSS), 인도인민당(BJP)이 삼위일체가 되어 힌두 국가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 동향을 흔히 '우경화'라고 한다.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다. 위태한 측면이, 아슬아슬한 지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어떤 돌파구를 열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20세기 민족 해방 운동의 어떤 곤경을 해결해가는 통과 의례, 시행착오처럼 보인다. 민족 해방의 결정적 역설, 즉 '혼/백의 분단 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접수되는 것이다.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한다.

▲ 사바르카르에게 절하는 모디. ⓒwikipedia.org
[유라시아 견문] 민족 해방의 역설 : 혼/백의 분단 체제
동포를 미개인 취급한 독립운동가, 왜?
민족주의의 역설
인도 모디 내각 인사 가운데 꼴불견이 없지 않다. 대개 민족봉사단 출신이다. 나라 경영에 주력하기보다는 엉뚱한 짓에 더 공을 쏟는다. 교육부 장관은 성탄절에 학교가 쉬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독교를 배타한 것이다. 내무부 장관은 모든 주에서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다.
힌두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며 우기는 인물까지 있다. 모디는 이들을 경질시켰다. 국사(國事)를 그르치는 힌두 근본주의와는 일선을 그은 것이다. 아무래도 시행착오, 통과의례로 보인다. 덜 세련되고 덜 정련되었다. 힌두 국가 만들기는 이제야 걸음마를 뗐다.
역사관도 거칠기 짝이 없다. 지나친 힌두 민족주의가 제 발등을 찍는다. 가령 1947년 인도 독립으로 '1200년' 외세 통치가 끝났다는 식이다. 어찌하여 100년(대영제국)도 200년(동인도회사)도 아니고 1200년인가? 8세기 서북에서 이슬람이 침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무굴제국까지 장장 1000년을 무슬림 국가가 득세했다는 것이다.
대영제국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 바다에서 틈입한 또 다른 외세였다. 고로 1947년은 1200년 만에 힌두 국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이 호기를 놓친 것이 국민회의이다. 대영제국의 계승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속주의를 표방했을 뿐더러, 무슬림들에게 특권을 베풀었다.
결국 외세의 침략 이전, 즉 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고대사 나아가 상고사를 탐닉한다. 인도는 고대부터 하나의 민족, '힌두인'이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일종의 자만사관이다. 그러나 자학사관의 자충수가 되고 만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부 유럽에서 아대륙으로 진출한 아라얀 족마저도 외세이다. 힌두교 역시도 외래 종교가 된다. 베다를 유일한 경전으로, 산스크리트어를 유일한 보편어로 삼자는 정치적 기획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생활 세계의 실감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인도인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비슈누, 시나, 칼리 등은 베다 이후 약 1000년 이후에나 등장하는 신들이다. 팔리어와 불교 문명이 인도에 미친 지대한 영향 또한 삭제해버리고 만다. 천 년의 불교, 천 년의 이슬람을 지우는 지독한 자폐사관에 봉착하는 것이다.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와의 촘촘하고 긴밀했던 연결망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힌두교만 섬겨서는 인도의 장구한 문명사를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법이다.
이들의 인도사 인식은 네루가 <인도의 발견>에서 구축한 인도사보다 더 앙상하고 빈약하다. 힌두 문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도리어 축소시킨다. 게다가 양쪽 모두 북인도 중심이다.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사 전체를 규정하려 든다. 무슬림이 인도에 온 것이 8세기이고, 12세기 델리에 술탄 국가를 세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슬림 권력은 데칸고원 이남까지 침투하지 못했다. 남인도는 별세계, 별천지였다. 가장 강성했던 무굴제국 아래서도 힌두 소왕국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며 무슬림과 공존했다. 심지어 아삼 지방을 비롯한 동북 지역은 무슬림 지배 아래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국지의 경험을 '민족사'로 과장하는 것이다.
외부인인 나로서는 힌두 문명의 저력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역사관을 제출해주기를 바란다. 제국사가 유력한 방편이 되어줄 것이다. 인도는 예외적으로 불교제국과 이슬람제국을 두루 겪은 장소이다. 아소카 황제와 아우랑제브 대제의 전성기를 공히 경험했다. 무굴제국에서는 인도-페르시아 문명의 대융합을 일구었고, 대영제국에서는 무굴제국의 성취에 유럽 문명까지 보태어 '벵갈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인도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유산이다. 인류사에 길이 빛난다.
물론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은 제법 달랐다. 영국령 인도는 영국의 또 다른 식민지, 미국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었다. 원주민들을 박멸하고 신세계를 건설할 수 없었다. 아메리카 '인디언'과 유라시아 '인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으로 단련된 인도인을 쓸어낼 수 없었다. 숫자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다. 소수의 영국인이 다수의 인도인을 표면으로 다스렸을 뿐이다. 그리고 본국으로 떠나버렸다. 건축물은 남았지만,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다.
무굴제국은 그러하지 않다. 뿌리를 내렸다. 토착화되었다. 인구가 그 소산이다. 현재 파키스탄 인구는 2억, 방글라데시는 1억5000만이다.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인도 총인구 16억 가운데 5억이 무슬림이었다는 말이 된다. 근 3할을 점한다. 단숨에 세계 최대의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힌두교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는 복합 제국적 성격을 자랑했을 것이다. 그만큼이나 무슬림은 오래도록 인도 아대륙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다. 떠돌이가 아니라 토박이가 되어갔다. 뜨내기에 그쳤던 영국인과 토착화된 무슬림을 병렬로 '외세'라고 치는 것 또한 역사의 실상과 크게 어긋난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대륙을 순차적으로 통치한 불교제국-이슬람제국-유럽제국의 2000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힌두 문명을 지속하고 있음이야말로 퍽이나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역사는 '진보'를 향해 질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층층이 축적되고 켜켜이 누적되었다. 그 독특한 역사의 지층을 이룬 기저야말로 여러 종교를 크게 감싸 안는 힌두교의 다종교-다문명적 성격이라 하겠다. 즉 정치적 제국성과 종교적 관용성이야말로 힌두 문명의 백미이다. 그 넉넉했던 힌두교의 전통을 힌두 민족주의가 방기하거나 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부디 20세기형 민족주의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힌두뜨와'의 본성과 근성을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 인도 곳곳에 자리한 힌두교 사원(델리). ⓒ이병한
민주주의의 역설
교조적 민주화 이론에 따르면 성/속의 분리 과정, 즉 세속화는 민주화의 선결 조건이다. 처음에는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다음에는 교회로부터의 단절을 추구했다. 인도의 국민회의 또한 그 이론에 충실했다. 헌법으로 세속주의를 명기하고, 힌두교에 가장 멀찍했다. 인도가 정체된 원인으로 힌두교를 지목하고, 발전에 뒤처지게 된 원흉이라 질타했다.
인도 민주주의의 커다란 역설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로 말미암아 힌두교가 복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대중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 절대 다수 사람들의 생활 세계가 여전히 힌두 문명 아래 자리했던 것이다. 출생과 결혼, 장례까지 삶의 주요 마디마디마다, 또 각종 축제와 명절 같은 한 해의 리듬 역시도 힌두교의 영향이 물씬하다.
국민회의는 기층 사회와 유리된 상부 조직에 그쳤다. 식민 모국의 영향이 드센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에 반해 인도인민당은 민간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토착적인 정당이다. 바람직한 정당의 이념형적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힘, 종교의 정치적 동원도 가능했다.
동시에 종교의 근대화도 자극했다. '해방된 개인'들을 묶어주고 엮어주는 접촉제로 힌두 문명의 전통이 환기되었다. 1990년대 이래 인도 역시 급변하고 있다. 나날이 세계화되고 있는 인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 등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힌두교이다. 민주화와 세계화, 힌두화가 공진화한다. 성과 속이 따로 놀지 않는다.
20세기의 최첨단을 달렸던 국민회의와 인도공산당으로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현상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21세기의 신청년들이 힌두뜨와에 가장 열렬하게 호응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유력지였던 신문과 잡지 또한 이제는 극소수만 읽는 매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살펴보자니 그들만의 은어로 푸념을 늘어놓는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전통적 복고주의에 세속적 민주주의가 납치당했다고 한다. 신중간층들이 경건하고 정갈한 브라만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또한 '뿌띠 부르주아의 허의위식'이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문장을 재차 읊어대는 대목에서는 하품이 나왔다.
국민회의의 세속주의는 중산층 이데올로기이고, 인도인민당의 힌두 국가 만들기는 반동적 수구파의 기획이라며, 인도의 장래를 '노동자 국가'에서 구하는 글은 차마 끝까지 읽어줄 수가 없었다. 그에 비하자면 '진보는 20세기의 아편이고, 근대의 허위의식'이라고 되받아치는 힌두뜨와 논객들이 훨씬 더 참신해 보였다.
이러한 역설적 풍경은 비단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 있다 보면 동아시아보다는 서아시아에 더 자주 눈을 돌리게 된다. 북부에 자리한 델리에서 석 달을 지내니 더더욱 그러했다. 비슷한 현상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에도 만연하다.
인도와 더불어 탈식민주의 이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국가로 알제리가 있다. 프란츠 파농이 널리 인용된다. 그가 프랑스 제국주의에 맞서 가담했던 집단이 민족해방전선(NFL)이다. 프랑스를 물리친 후 알제리에서 오래 집권했다. 그 NFL 역시 세속주의와 사회주의,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인도의 국민회의와 유사한 노선이었다. 사실상의 1당 체제를 오래 누렸다는 점에서도 엇비슷했다.
알제리서도 변화는 1980년대 말부터 전개된다. 다당제가 도입되자 곧장 이슬람 정당이 대약진했다. 종교에 뿌리내린 정치 문화가 (재)부상한 것이다. 이들은 세계를 좌/우의 시각으로 살피지 않는다. 성/속의 관계로 접근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시민민주)와 사회민주(인민민주)는 오십보백보이다. 공히 영성을 배제한 세속 정치, 이성의 독재 체제이다. 그들의 실감으로는 이성이 영성을, 과학이 종교를 억압하는 20세기야말로 '암흑시대'이다. 그리하여 교조적 민주주의에 맞서 전통과 문명을 수호하는 전투적인 종교 운동이 정치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첫 물꼬를 틔운 것은 1979년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이었을 것이다. 그 후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실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히 시민 민주주의와 인민 민주주의를 대체해가는 '제3의 물결'이라 할만하다. 기어이 21세기 유라시아사의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아랍 세계의 세속화를 가장 먼저 견인했던 터키마저도 탈세속화와 재이슬람화에 합류하고 있을 정도이다. 근대 정치에 대한 반혁명, 대항 혁명이 한창이다. 비근대적 정치가 만개하고 있다.
당장은 이 '새 정치'를 일방으로 편들기가 힘듦이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로 민족봉사단 출신의 관료들이 노정하는 작태처럼 반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왕년의 신정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만도 아닐 것이다.
정교 일치와 정교 분리를 물과 기름처럼 맞세우는 이분법 자체가 근대의 편견일지 모른다. 본디 정치는 도덕과 불가분이었다. 단순히 자원의 분배 과정, 이해득실의 조정 과정에 그치지 않았다. 도덕의 구현이자 양심의 실현을 지향했다. 허나 근대 정치는 자유 민주와 사회 민주를 막론하고 도덕과 영성을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말았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의 이해타산을 조정하는 소인들의 정치가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이곳 인도에서, 또 유라시아의 동과 서에서 정치과 종교, 정치와 도덕이 다시 합류해가고 있다. 장차 민주주의의 대전환, 대반전을 예감하는 까닭이다.

▲ 홀리(Holi). 3월의 봄맞이 축제.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색의 향연을 펼친다. ⓒ이병한
민족 해방의 역설
민족 해방의 역설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커다란 도착이 일어났다.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착종되고 말았다. 민족 해방 운동의 대국을 쥔 쪽은 '자강파'보다는 '개조파'들이었다. 급진적 변혁을 추구했다. 이들의 민족 해방은 야심찬 반면으로 모호한 것이기도 했다.
전통을 배척하면 할수록 식민 모국과 닮아가는 자가당착이 일어났다. 개인의 자유, 정치적 독립, 시민권, 민주적인 정부, 과학적인 교육, 경제적인 발전 등등, 식민 모국의 '문명화 사업'을 흉내 내고 내면화한 것이다. 일급의 사상가와 운동가들마저 '민족 개조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장기간의 문화 내전을 초래했다. 결국은 영국 같은 인도가 되는 것이, 프랑스 같은 알제리가 되는 민족 해방의 목표처럼 되고 말았다. 말미암아 서구화된, 혹은 식민화된 엘리트들과 토착적 민중 사이의 심대한 분단 체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과 싸우는 혼과 백의 분단 체제였다.
그러나 인도의 국민회의나 알제리의 민족해방전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화적 헤게모니를 틀어쥐지는 못했다. 재생산에도 실패했다. 탈냉전이 시작되기 무섭게 전통과 종교와 문명이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추진했던 '새 것 프로젝트'가 가능한 곳은 따로 있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신대륙'이다. 원주민의 옛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 사람과 새 문화를 이식할 수 있었다. 즉 신대륙의 신문화는 정치적 운동의 산물만이 아니었다. 더 결정적으로는 지리적 이동의 산물이었다. 이민 국가의 탄생, 즉 이민을 통한 혁명이었다.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을 지워버림으로써 인문 지리의 전면적 개조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라시아는 아메리카가 될 수 없었다. '아메리칸 아담'을 창조할 수가 없었다. 인류의 4대 문명, 기축 문명의 근거지이기 때문이다. 200년 새파란 근대 문명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장구한 문명적 유산이 민중의 생활 세계에 존속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뿌리가 민주주의의 장착과 더불어 도저하게 재귀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민족 해방 운동이 기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주의와 정통주의로 삐뚤어지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탈근대적 정치로 새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동과 반전이 커다랗게 교차한다. 어느 쪽이 대세가 될지 장담하기는 아직 힘들다. 다만 정/교 분리, 성/속 분리의 '근대 정치'가 영영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혼과 백을 재결합하는 제2의 민족 해방 운동이 유라시아 도처에서 굴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생 국가들이 건국기를 지나 수성기와 중흥기로 진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체성 확립(독립)에 이어 정체성 재건(중흥)이 시대정신이 되어간다.
진중한 얘기를 오래 했다. 글을 쓰는데도 어깨가 굳는다. 목이 딱딱해진다. 조금 느슨해지기로 한다. 매주 일요일, 원고를 마치면 영화를 한 편씩 보았다. 춤과 노래가 일품인 인도 영화는 흥에 겨웠다. 태평양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인도양에는 발리우드가 있다. 또 하나의 글로벌 문화지리를 구축해가고 있다. 발리우드의 도시, 뭄바이로 간다.

▲ 힌두식 마을 결혼식. 브라만이 주례를 한다.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뭄바이 : 글로벌 발리우드
<타이타닉>은 인도양에서 침몰했다
봄베이와 뭄바이
작년(2015년) 가을 부산 영화제에 다녀왔다.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다. 나는 인도 영화를 몰아서 보았다. 개막작부터 <주바안>이었다. <카슈미르의 소녀>도 챙겨보았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꼭 방문할 곳으로 꼽아두고 있었다. 영화제는 10월이었고, 인도행은 11월이었다. 시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 후 매주 한 편씩 인도 영화를 챙겨 보았다. 콜카타와 첸나이, 뭄바이와 델리 등 여러 곳에서 보았다. 장소만큼이나 언어도 다양하다. 힌디어 외에도 벵골어, 구자라티어, 타밀어 등 16개 언어로 제작된다. 비단 인도서만도 아니다. 인도의 안과 밖을 오가는 하늘길에서도 인도 영화를 접할 수 있었다.
양곤에서 콜카타로 가는 에어아시아도, 델리에서 콜롬보로 가는 스리랑카항공도, 카트만두에서 테헤란으로 이동하는 에미레이트항공도 기내 영화의 절반이 인도 영화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인도양과 남유라시아는 단연 발리우드의 영향권이다.
실로 인도는 영화 강국이다. 1년에 1000편 넘게 생산한다. 날마다 2, 3편씩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매일같이 새 영화가 쏟아진다.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앞선다. 세계 최대의 영화 생산국이다. 인구만큼이나 관객 숫자도 굉장하다. 극장을 찾는 사람이 일일 평균 1500만 명이다. 1년이면 자그만 치 40억 명이다. 흥행 성적도 상당하다. <타이타닉>도 <아바타>도 인도에서는 흥행 수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자국 영화가 할리우드보다 경쟁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인도 영화의 관객 비중이 근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런 인도의 영화 산업을 가리켜 '발리우드(Bollywood)'라고 통칭한다.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이다. 본래는 1970~80년대 해외로 이주한 인도인, 즉 인교(印僑)들이 붙인 별명이었다. 정작 봄베이의 영화인들은 내켜하지 않았다. 할리우드의 아류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살라 영화'라고 했다. 마살라는 양념이라는 뜻의 힌디어이다. 온갖 양념을 버무려 먹는 인도 음식처럼 다양한 장르를 혼합시킨 인도 영화에 안성맞춤 표현이다. 한 편의 영화에서 로맨스와 액션, 코미디를 모두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과 구미학계에서 발리우드가 정착어로 굳어갔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조치로 인도와 세계가 전면적으로 (재)접촉하면서 인도에서도 일상어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발리우드 투어'가 뭄바이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다. 아랍인과 아시아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봄베이가 뭄바이로 개명한 것이 1995년이다. 부산 영화제가 출범했던 바로 그해이다. 1991년 인도판 '개혁 개방'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봄베이는 전형적인 식민 도시였다. 런던(유럽)과 두바이(아랍)와 싱가포르(동남아)와 홍콩(동북아)을 잇는 대영제국의 중간 기착지였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개항장 도시로 급성장했다.
콜카타가 학문의 중심, 델리가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봄베이는 단연 경제의 중심이었다. 돈이 흐르면 문화도 꽃피기 마련이다. 상업 자본과 문화 자본이 결합하고 결탁했다. 봄베이로 파운드가 몰려들면서 영화 산업도 커져갔다. 그러나 독보적인 지위는 아니었다고 한다. 주요 도시들에서 저마다의 영화를 만들었다.
1947년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성립이 영화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콜카타와 라호르(현재는 파키스탄) 등 북인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영화인들이 대거 봄베이로 이주한 것이다. 독립 이후 힌디어가 제1언어가 된 것도 봄베이에 유리했다. 지방어를 쓰는 첸나이와 하이데라바드(Hyderabad) 등에 비해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콜카타의 영화는 문학적이고 예술적이었다. 첸나이는 남인도 특유의 신화적 성격이 강했다. 구자라트 영화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이었다. 반면 봄베이의 영화는 '민족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지방색을 지워냄으로써 독립 이후 인도 영화 산업의 중추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1947년 독립 이후에도 도시의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다. 반세기가 더 지나서야 뭄바이라는 원래 이름을 회복한 것이다. 역시나 1990년대 이후 인도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세계화와 힌두화'의 공진화의 산물이다. 느지막한 탈영국화였다. 공교롭게도 1995년은 한국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된 해이기도 하다. 탈냉전이 곳곳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촉발했던 것이다. 고쳐 말하면 냉전기는 식민기의 후반전, 후기 식민(post-colonial)이었다는 뜻도 된다.
1990년대 이래 등장한 신중간층의 문화적 취향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더 이상 영국적인 것을 편애하지 않는다. 인도적인 것을 즐긴다. 더 정확하게는 힌두적이다. 이들이 힌두 영화를 적극 소비함으로써 발리우드가 융성하는 기초를 다졌다. 신보수주의, 혹은 신전통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동향과 맞물려 식민 도시 봄베이가 글로벌 도시 뭄바이로 거듭난 것이다. 21세기 뭄바이는 복고와 첨단이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인도 최대의 도시이다.
국민 국가의 영토성에 충실했던 국민회의와 달리 힌두뜨와를 강조하는 인도인민당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있는 2500만 인교들을 중시했다. '비거주 인도인'이라는 별개의 범주를 만들어 이들의 투자를 적극 독려했다. 이중 국적을 부여하고 '해외 인도인의 날'도 제정하여 크게 기념한다.
인도와 인교의 재결합을 상징하는 영화 장르도 있다. 소위 '인교 로맨스'이다. 1990년대 후반 재영 동포, 혹은 재미 동포의 인도 귀환과 본토 여성과의 로맨스가 크게 유행했다. 대표적인 스타가 샤룩칸(Shah Rukh Khan)이다. 1998년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Bapa Kuti]의 주인공이었다. 나사(NASA)에서 근무하는 뛰어난 과학자였던 그가 인도에 돌아와 가족과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는 귀환의 서사를 선보인다. 응당 본토 아가씨를 만나 낭만적인 사랑에도 빠진다. 흡사 1994년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사랑은 그대 품안에>의 차인표를 연상시킨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공짜로 볼 수 있다. 근 20년 전 작품을 복기하노라니 극중 이름이 더 흥미롭다. 남자 주인공은 모한(Mohan)이고, 여자 주인공은 기타(Gita)이다. 곧장 '모한다스' 간디와 <바가바드 기타>를 연상시킨다. 간디 또한 영국에서 유학하고 남아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인도로 돌아온 인물이다.
귀국 이후에는 힌두교와 자니교를 비롯한 인도의 전통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갔다. 20세기와는 또 다른 21세기형 귀환 서사라고 하겠다. 인도와 세계의 재결합, 지구화와 힌두화의 공진화를 매개하는 인물로 샤룩칸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약 발리우드를 상징하는 슈퍼스타로 등극하여 오늘까지 변함없는 명성을 누리고 있다.

▲ 뭄바이 멀티플렉스 극장. ⓒ이병한
인류(印流) : 멀티미디어+멀티내셔널
인도에서 1991년 이후 태어난 신세대만 3억50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전혀 딴 판이다. 부모들이 자랄 때는 국영 방송국만 달랑 둘이었다. BBC와 MTV, Star TV 등 위성방송이 진출한 것이 1991년이다.
곧이어 인도의 독자적인 대중문화 채널 ZEE도 등장했다. 인도판 MTV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영화 음악에 주력한다. 음악 채널과 영화 채널이 결합되었다. 빌보드처럼 매주 순위도 발표한다. 나아가 발리우드 전체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영화제도 주최한다. 개최 장소도 뭄바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바이, 도하,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을 순회한다. 인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영화제이다.
스포츠 채널도 각광이다. 영국에 EPL(English Premier League)이 있다면, 인도에는 IPL(Indian Premier League)이 있다. 크리켓 리그이다. 유럽의 축구, 미국의 야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 숙명의 라이벌전은 '엘 클라시코'에 빗대기도 한다. CF 모델의 상당수도 크리켓 스타들이 채우고 있다.
미디어 산업의 약진은 인도가 자랑해마지않는 정보기술(IT) 산업과도 결합되었다. 젊은이의 상당수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영화와 방송을 소비한다. Saavn.com은 발리우드 영화와 음악이 소비되는 전 지구적인 메카이다. Indiafm.com은 발리우드 전용 포털 사이트이다. 영화 생산부터 마케팅은 물론 비평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소셜 미디어까지 융합된 멀티미디어 환경은 발리우드의 영토 확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대영제국의 연결망을 따라 인도양에 산재했던 인교들에 호구되었고, 점차 지리적 범위를 넓혀 태평양을 건너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까지 접속되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피지, 나이지리아, 두바이에서 영국과 미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산업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제는 기획과 제작, 유통 전 영역에서 인도와 인도양,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연결망이 항상적이다. 발리우드 문화 상품이 전 지구적으로 환류하면서 영토에 구애받지 않는 공동체, '발리우드 공화국'을 만들어간다. 한류 못지않은 인류(India Wave)이다.
멀티미디어와 멀티내셔널의 혼합은 영화 자체의 텍스트와 내러티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매체 환경이 상시화 되면서 상영관에서의 흥행뿐만이 아니라 개봉 이후의 지속적인 소비를 겨냥하게 되었다. 특히 발리우드 영화는 춤과 노래가 백미이다. 영화 가운데 일부를 고스란히 떼어내어 뮤직 비디오로 향유한다. 영화의 맥락 밖에서, 온라인에서도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내러티브에 종속되지 않고 별개의 독자성과 생명력을 누리는 춤-노래 시퀀스가 3~4분 단위로 편성되는 까닭이다. 영화 이후의 음악과 뮤직 비디오는 발리우드의 이동적이고 유동적 소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한다.
애초 발리우드 영화에 춤과 노래가 두드러졌던 것은 지극히 인도적인 맥락의 산물이었다. 원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 그렇다고 중화제국 같은 통일적인 권력 아래 있지도 않았다. 동일한 문자를 다르게 발음하는 한자 같은 표의 문자도 없다. 20개의 공식어와 그보다 훨씬 많은 방언이 하나의 국가 아래 자리한다. 게다가 저마다 상이한 표음 문자를 쓴다. 일상적인 다언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 자막을 통해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역마다 번번이 다른 자막을 깔아야 한다. 응당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춤과 노래가 발달해간 것이다.
콜카타와 뭄바이, 델리 같은 대도시에서 인도인들의 첫 대면 풍경이 몹시 흥미롭다. 처음에는 영어로 통성명을 한다. 그리고 각자의 출신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진다. 국내와 국외의 가름이 모호한 것이다. 응당 '민족 문학'이라는 것도 성립하기가 힘들다. 민족 문학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영화가 수행한다. 언어의 장벽을 음악과 몸짓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춤과 노래가 또 하나의 언어로써 모국어의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
힌디어 영화는 아무래도 북인도 중심이다. 그러나 춤과 노래를 통하여 다민족, 다지역의 전통을 덧붙인다. 펀자브의 민속 음악을 따오고, 타밀의 전통춤을 빌려와서 콜라주하는 식이다. 즉 발리우드의 영화 생산 자체가 다민족적이고 초민족적이다. 협동과 협주에 익숙하다. 이러한 인도 내부의 경험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글로벌 발리우드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힌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도양의 아프로-아랍(Afro-Arab) 관객들도 발리우드 노래만은 흥얼거릴 수 있는 까닭이다. 하긴 인도는 이미 아프로-아랍 세계를 내부에 품고 있다. 유라시아와 인도양이 만나는 곳에 인도 아대륙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 발리우드 투어 쇼 프로그램. ⓒ이병한
글로벌 발리우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타이타닉>의 해이기도 했다.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내기가 되었던 나는 1995년 창간한 <키노>와 <씨네21>을 읽으며 교양을 쌓아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할리우드의 영향권 아래 있는 태평양 국가의 현상이었다. 군사 독재자 수하르토가 실각하고 정권 교체를 달성한 1998년의 인도네시아에서는 [Kuch Kuch Hota Hai]가 더 큰 인기를 모았다. 발리우드 작품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섬인 자바인들이 열광했다고 한다. 자바인들은 벵골만을 사이에 두고 남인도와 혈연과 지연으로 긴밀하다.
비단 인도네시아만이 아니었다. 아라비아 해를 건너 남아프리카 더반에서도 [Kuch Kuch Hota Hai]는 8개월이나 장기 상영되었다. 1998년이면 만델라가 임기를 마친 해이다. 만델라의 정당이 바로 '국민회의'였다. 남아공의 국민회의와 인도의 국민회의는 간디로 이어진다. 만델라를 이어 남아공 국민회의의 당수를 맡은 이가 간디의 증손주였던 엘라 간디(Ela Gandhi)였다. 그녀는 [Kuch Kuch Hota Hai]의 주제가를 총선 캠페인 음악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탈냉전과 더불어 봇물이 터진 발리우드의 대약진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었다. 냉전기에 뿌렸던 씨앗들을 하나둘 거두어가는 수확이었다. 비동맹 외교를 통하여 선업을 짓고 공을 쌓았던 것이다. 1957년작 [Mother India]는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 국가들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리우드의 '문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시아-아프리카 권역에서 널리 환대받았다.
1965년 반둥 회의 10주년 기념차 자카르타를 방문했던 김일성도 수카르노의 추천으로 이 작품을 보았다고 한다. 그 후 평양에서도 상영되었는지는 확인이 힘들다. 여하튼 비동맹 외교의 30년 역사가 있었기에, 1990년대 이래 발리우드 영화들이 서아시아로, 북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구미적 근대에서 지구적 근대로 이행하는 길목에 발리우드가 자리한다고 하겠다. '인도형 지구화'의 진원지이다.
고로 발리우드는 할리우드의 아류에 그치지 않는다. 또 68 혁명 이래 서구에서 유행했던 '제3세계 영화'나 '월드 뮤직' 붐과도 다르다. 비서구가 원천을 제공하고 서구의 거대자본이 제작하는 신식민주의적 생산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다. 전통악기와 토착어로 노래하며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무했던 뉴에이지풍 네오-오리엔탈리즘을 변주하지도 않는다. 대안적 근대화, 대안적 지구화라며 아카데미 특유의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다. 그간의 세계화를 보충하는 보완재라고 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구미의 일방적인 문화 패권이 저물고 지구적 문화를 향유하는 '민주화'와 '정상화'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탈근대가 아니라 꽉 찬 근대(Full Modern)로 들어서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한 세계로 변해간다.
인도에 머문 6개월, 내가 보았던 30여 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8년 개봉한 <악바르>였다. 악바르 대제는 무굴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가운데 한 명이다. 특히 힌두 공주와 결혼한 술탄으로 유명하다. 무굴제국이 달성한 페르시아-힌두 문명의 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 영화는 악바르를 페르시아어를 말하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래인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위대한 인도인'으로 접수한다. 나아가 대영제국 이전부터 이미 구현되었던 '세속주의'도 환기시킨다. 인도는 영국이 도래하기 전부터 종교로 배타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유럽식 정교 일치가 부재했기에, 세속화=근대화의 공식도 통용될 수 없었다. 도리어 일찍이 종교적 관용과 아량으로 넉넉했던 무굴제국의 위엄을 과시한다. 힌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공생했던 역사적 전범을 화려한 영상미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스크린 밖 '힌두 민족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세련되었다. 글로벌 발리우드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영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발리우드의 장래에 성원을 보낸다. 어느새 나도 '발리우드 공화국'의 시민이 되었다.
발리우드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인도 문화가 있다. 요가이다. 이미 세계인이 즐기는 운동이자 수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인도의 세계화에 앞서 요가부터 세계화되었다. 인도를 견문하면서 요가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 ⓒi.ytimg.com](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521/art_1464042203.jpg)
▲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에서 큰 인기를 끈 발리우드 영화 [Kuch Kuch Hota Hai](1998년).
나는 요가 마니아이다. 2007년 입문했으니, 올해로 9년차이다. 책 읽고 글을 쓰다보면 목과 어깨가 자주 굳는다. 근육이 뭉치면 머리도 탁해지기 십상이다. 흐릿한 정신으로 쓰는 글은 아니 쓰는 것만 못하다고 여긴다. 타개책으로 삼은 것이 요가 수련이었다. 효과가 톡톡했다. 요가 한 시간이면 말랑말랑하게 풀어줄 수 있다.
한창 때는 술자리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요가를 하고 돌아갈 정도였다. 여유가 있는 날이면 서너 시간 씩도 했다. 못해도 1년에 300일은 했을 것이다. 지금껏 근 3000시간을 수련했다는 말이 된다. 하루라도 요가를 하지 않으면 몸에 가시가 돋는 듯하다.
작년(2015년)부터 유라시아 곳곳에서 요가를 하고 있다. 북방의 울란바토르서도, 적도의 자카르타에서도, 지금은 테헤란에서 하고 있다. 얼굴에 철판을 깐다. 현지에서 1년 이상 살게 된 특파원 시늉을 낸다. 며칠 수련해보고 가입하겠노라 하면 보통 2, 3일 자유 이용권을 주는 것이다. 조금 오래 머무르는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 요가원을 순회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타 요가, 빈야사 요가, 아쉬탕가 요가 등은 이미 표준화되었다. 강사가 몽골인이고 중국인이고 일본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동작은 비슷하다. 그런데 동남아로 진입하는 순간 풍경이 달라진다. 인도인 강사가 영어로 직접 가르친다. 그 경계가 베트남의 하노이이다.
하노이부터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만달레이는 인도에서 온 요기(Yogi)들이 주를 이룬다. 벵갈루루와 첸나이 등 남인도 출신들이 많다. 남인도와 동남아가 벵골만을 '지중해'로 삼은 하나의 생활 세계임을 실감하는 것이다.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북미로 이주해간 숫자보다 남인도에서 동남아로 이주해간 인도인들이 더 많다. 히말라야가 자연적인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동북아와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하여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울러 동아시아라고만 묶고 마는 것도 동북아인의 상투적인 편견일지 모른다. 종교망, 친족망, 생활망, 문화망에서 동남아는 동인도와 몹시 긴밀하다.
인도 견문 6개월, 응당 요가가 빠질 수 없었다. 석 달을 생활한 델리에서는 부러 마을 요가원을 찾았다. 대도시의 천편일률적인 요가에 싫증이 나던 차였다. 요가의 본고장을 찾았으나 콜카타나 뭄바이나 서울과 베이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구글에서 검색하니 숙소 가까운 곳에 작은 요가원이 나온다. 조금 더 일상적이고 전통적이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다.
방문해보니 놀랍게도 내 또래의 한국인 여성이 운영하는 곳이다. 20대 후반, 배낭여행 하다가 인도 사내랑 눈이 맞아서 눌러 앉았단다. 그것도 특별한데, 내가 한국에서 다니던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요가원과도 연이 닿았다. 그곳 원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준다. 어쩜 이럴 수가. 남아시아 하고도 인도, 인도 하고도 델리, 델리 하고도 '마유르 비하르'라는 후미진 동네에서, 홍대 요가원 출신 한국인과 조우하다니.
하루는 그들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김치찌개와 탄두리 치킨을 안주로 삼아, 참이슬 소주에 킹피셔 맥주를 섞은 인도-한국 우정주를 나누어 마셨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남편은 펀자브 출신. 무슬림이 많이 사는 북인도가 고향이었다. 그의 조부모는 카라치(현재 파키스탄)에서 오셨단다.
20세기 최대의 분단 국가,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서면서 펀자브로 이주한 힌두교 피난민 집안이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나로서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뜻하지 않게 자자손손 구전되는 생생한 분단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글로벌 연결망과 요가의 세계화가 빚어낸 예기치 않은 인연이었다.

▲ 전함 위에서 요가를 수련하는 인도 해군. ⓒwikimedia.org
요가의 미국화
아무래도 남들보다 요가 소식에도 밝은 편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그랬다. 큰 이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남다른 시범 종목 이벤트가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요기들이 런던의 주경기장 앞에서 기묘한 몸부림을 선보였다. 요가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헌데 그 추진 주체가 이채롭다. 인도가 아니었다. 인도는 도리어 반대했다.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요가의 본디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도다운 기질이다. 힌두교에도 '선교(Mission)'라는 개념이 없다. 나에게 좋다하여 남에게 (강)권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했던 동방의 윤리와도 차이가 있다. 나와 남의 관계보다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한다. 사회성을 담지한 '君子(군자)'보다는 개인성을 고수하는 '聖者(성자)'의 나라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러했다. 인도에서 생겨난 국가가 대외 팽창을 시도한 바 거의 없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부터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에 이르기까지 늘 외부에서 아대륙으로 진출해왔다.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원리와는 좀체 거리가 먼 것이다. 요가와 금메달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요가의 올림픽 진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전미요가협회는 물론 미국 체육회도 전폭 지원한다. 그래서 올해 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가 아니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더라면 수월하게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요가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32개국 대표 100여 명이 참가해 우열을 가렸다. 이들은 요가가 올림픽 종목이 되면 요가 중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나 미국다운 발상이다. 표준화, 대중화, 민주화에서 단연 발군이다.
이미 요가는 대성황이다. 현재 미국의 요가 인구는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요가 월간지만 10여 개를 헤아린다. 수강비와 비디오, 요가복, 요가 매트 등 관련 산업은 6000억 달러 규모이다. 요가 강사는 10만 명을 돌파해, 인도의 17만 명을 추격하고 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월등히 많다고도 하겠다.
기실 핫요가는 물론이요 하타 요가, 탄트라 요가, 아쉬탕가 요가 등 각종 요가의 명칭 또한 미국에서 고안된 것이다. 현재 미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요가만 150여 개에 달하고, 요가원 상표는 2000개를 넘는다. 그래서 수련법의 소유권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맥도날드화된 요가(McYoga)의 거두로 비크람 초드하리(Bikram Chowdhary)를 꼽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억만장자로, 핫요가 제국의 건설자이다.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다. 26개의 동작과 두 개의 호흡으로 구성된 1시간 30분의 표준적 수련법을 창안한 원조이다.
자세뿐 아니라 온도(41도)와 습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비크람 요가 학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한다. 최초의 비크람 요가원이 로스앤젤레스(LA)의 올림픽 대로변에 있다. 마침 내가 살던 집에서 15분 거리였다. 몇 차례 다녀본 적이 있다.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뜨거워서 나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땀을 내고자 하는 인공적인 환경부터가 마땅치 않았다. 자연스럽지 않고 작위적이었다.
최근의 논쟁은 "Yoga to the People"이라는 요가 보급 운동으로 촉발되었다. 온도를 낮추고, 수강료는 대폭 인하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덜 힘든 조건에서 요가를 보급하겠다는 취지이다. 허나 비크람은 이들을 고소했고, 손해 배상과 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핫요가는 반드시 자신이 정해둔 동작과 온도와 습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엄연한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지극히 미국적인 풍경이라 하겠다. 공유보다는 소유에 능하다. 실은 전미 요가 대회를 만들고, 요가의 올림픽 종목 채택 로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역시 비크람이다. '요가의 미국화'를 이끈 장본인인 것이다.
반문화(counter-culture)
비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 LA에 첫 요가원을 차린 것이 1974년이다. 당시 적지 않은 요기와 구루(Guru)가 미국을 찾았다. 독립 이후 인도는 힌두교와 요가를 억압하지는 않았으되, 딱히 장려하지도 않았다. 세속주의와 사회주의를 양대 축으로 삼아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전통 문화와 민간 문화는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구미에서는 근대성의 대안으로 동방의 종교와 수련법을 주목했다. 특히 1960년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68 혁명과 반(反)문화의 영향으로 요기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졌다.
당시 반문화의 추세는 크게 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마오쩌둥, 호치민, 체게바라로 상징되는 제3세계 사회주의에 대한 열광이다. 미국뿐 아니라 소련의 '적색 제국주의'와도 척을 지는 비서구 영웅들이 68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에 반해 서구의 물질주의에 반감을 품은 히피들은 개인의 영성을 고양하는 동방 종교에 감응했다.
전자는 세계의 혁명을, 후자는 개인의 혁명을 꿈꾸었던 셈이다. 군자(혁명가)가 될 것이냐, 성자(수도자)가 될 것이냐. 꼭 갈리는 것만은 아니었으되, 방점의 차이는 있었다고 하겠다. 전자의 흐름은 주로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 등 대학에 기반을 둔 고급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다. 후자는 시장과 접속하여 '뉴 에이지(New Age)'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낳았다. 웰빙과 힐링 등 '대중문화의 종교화'가 전개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고등 종교와 대중문화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은 비틀즈였다. 당대의 아이콘 존 레넌과 폴 매카트니는 직접 인도를 찾았다. '만트라'와 '구루' 같은 어휘들이 유행하고, 호흡과 명상은 깨달음의 비법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비틀즈가 스승으로 모셨던 마하라시(Maharishi)도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누비며 강연 여행을 다니느라 분주했고, 각종 잡지와 TV 토크쇼에서 마하라시를 접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탈혁명, 탈정치 분위기와도 딱 들어맞았다. 저마다 내면과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기실 '자기 계발', '자기 관리', '자아 배려' 등 신자유주의의 수사학은 뉴 에이지 운동의 세속화된 후속물이기도 하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동방의 종교를 기민하게 소비하여 68 혁명의 파고를 타고 넘은 것이다. 반문화의 거점이었던 캘리포니아는 다문화로의 전환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고, 동과 서가 융합되는 곳이었다.
하더라도 전통 요가의 꼴은 유지되었다. 여전히 신성과의 합일에 도달하는 호흡과 명상이 강조되었다. 비둘기 자세와 고양이 자세 등 각종 포즈를 취하는 것은 요가의 지엽에 그쳤다. 그 말단이 요가의 전부인 양 돌출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몸을 가꾸는데 방점이 찍힌 미국식 요가가 전면화된 것이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이가 마돈나이다. 1998년 발표한 마돈나의 앨범 [Ray of Light]는 3개의 그레미 상을 수상하고, 2000만 장이 팔려 나간 메가 히트작이다. 이 앨범에 실린 오리엔탈 풍 노래에서 그녀는 샨티~샨티~ 산스크리트어를 암송한다. 힌두교와 불교에 심취했음을 알리고, 매일 요가를 수련한다고도 밝혔다. 요가가 MTV와 할리우드의 주류 문화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슈퍼스타 마돈나와 조우함으로써 요가는 아름다움과 젊음을 가꾸는 비법으로 각광을 받았다. 헬스클럽에서 에어로빅을 밀쳐내고 요가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된다. 점차 명상은 줄고, 심박 수를 늘리고 땀을 흘리는 동작들이 강조되었다. 이제는 매트 위를 벗어나 공중에서도 수상에서도 요가를 한다. 어느덧 가장 핫하고 쿨한 피트니스가 된 것이다.
소비 문화
요가는 그 자체로 독특한 스펙터클을 연출한다. 공원과 해변에서 수백 수천의 엉덩이가 하늘을 향해 일제히 치솟는 풍경을 심심찮게 목도할 수 있다. 야외 요가 수련이 일대 유행이다. 이 새 천년의 문화 현상에는 명품 요가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이 한몫 했다.
룰루레몬이 창립한 해가 마돈나의 앨범이 발표된 1998년이다. 현재 북미와 유럽, 아시아 각국에 14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다. 현 CEO 크리스천 데이(Christine Day)는 스타벅스에서 20년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 경영자이다. <포춘>이 뽑은 '독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CEO'로 등극한 적도 있다. 스타벅스의 '커피로 여는 아침'의 이미지 마케팅을 룰루레몬으로 옮겨와 '건강을 입는 옷'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다. 탁월하고 노련한 경영자이다.
룰루레몬의 슬로건은 "세상을 평범함에서 구하고 위대함으로 이끈다"이다. "작은 진리를 매주 고객들에게 전하는 기업"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 주의 어록'을 발표하고 있다. 대개 인도 성자들의 잠언들이다.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 <요가 수트라> 같은 힌두 고전의 문구들도 인용한다.
차별화는 매점에서도 이루어진다. 요가 강사로 꾸려진 직원들은 '선생님(Educator)'이라 불리며, 고객은 '내빈(Guest)'이라고 한다. 요가로 맺어지는 공동체, '아쉬람'(Ashram)을 지향하는 것이다. 야외 요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룰루레몬 요가복을 입고 참여한다. 에브릴 라빈도, 브룩 쉴즈도, 케이트 윈슬릿도 모두 룰루레몬을 입는다.
허나 이들이 순전히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룰루레몬 중독자(Lululemon Addict)'를 자처하는지는 의문이다. 엉덩이와 몸매를 예쁘게 돋보이게 해주는 체형 보정 기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한 벌에 100달러가 넘건만, 불티나게 팔리는 까닭이다. 룰루레몬을 입고 요가를 하는 늘씬한 몸매가 어느새 영성적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별 짓기'의 징표가 된 것이다.
1960년대 반문화의 조류로 출발한 요가가 다문화의 한 요소가 되었다가 이제는 소비 문화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히피가 여피가 되어갔듯, 뉴 에이지가 새 시대를 열어젖힌 것 같지도 않다. 과연 문화의 전파란 토착화를 거치기 마련이다. 고대 인더스 강에서 비롯한 특유의 영성 수련법이 20세기 태평양을 건넘으로써 탈인도화, 탈힌두화, 세속화되었다.

ⓒndtv.com
요가의 재인도화?
2015년 6월 21일, 뉴델리에서 야외 요가 행사가 열렸다. 룰루레몬이 주최한 것이 아니다. 인도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요가의 날'이었다. 3만7000명의 요기 앞에서 모디 총리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삐딱한 시선이 없지 않다. '힌두 국가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전통 문화를 진흥시키는 '國風(국풍)' 운동의 혐의를 두는 것이다. 모디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학교와 군대에도 보급하겠노라 한다. 인도의 소프트 파워라며 대외 홍보에도 열성이다.
유엔(UN) 총회 연설이 상징적이다. 기후 변화의 대안으로 요기적 삶(The Art of Living)을 강조했다. 요가는 본디 산스크리트어이다. 신성과 하나 됨을 의미한다. 동방 식으로 옮기면 인성과 천성의 합일을 뜻한다. 인성을 갈고 닦아 천성을 밝히는 사람, 人乃天(인내천)을 실천하는 이가 요기이다. 요가의 그 다양한 자세 또한 신성과 하나 됨에 이르는 방법, 즉 修身(수신)의 기술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적인 평화의 달성, 해탈에 주력했다. 해방과 변혁이라는 정치적 기획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도사에는 '역성 혁명'이 부재하다.
그런데 모디의 연설은 조금 더 나아갔다. '지속 가능한 지도자(Sustainable Leadership)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출했다. 대안적 지도자상을 입안하는데 요기적 삶이 요긴하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지도자'의 핵심 덕목으로는 영성(Spirituality)을 꼽았다. 정치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와 세계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 간(International), 세대 간(Intergenerational)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조금 더 나은 지구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 해묵은 논쟁을 넘어서, '向上心(향상심)의 고취'라는 정치의 색다른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언뜻 어디서 들어본 말인 것도 같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했던 100년 전 조선인의 말씀이 떠오른다. 종교적 선각자의 발화가 세속적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과 속의 재결합, 재영성화의 징후로 접수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재차 모디의 연설을 동방 식으로 번역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지도자'란 성자보다는 군자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利(리)'보다는 '義(의)'를 높이는 사람, 욕심보다는 양심을 따르는 사람,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치를 따지는 사람, 이른바 '大丈夫(대장부)'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소인 정치였다. 계급적 이해, 지역적 이해, 성별적 이해 등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의 총합(=일반 의지)을 따른다. 그래서 질적인 판단보다는 양적인 판단을 추수한다. 소인과 군자도 평등하게 대접한다. 정치의 시장화,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반면으로 그 집합적 선택에서 초래되는 기회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외부(투표권이 없는 외국과 후세와 자연)에 전가해왔다. 소탐대실을 경계하는 '지속 가능한 지도자'라면 지양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집권 2년차, '요기 총리'를 자처하는 이가 다스리는 인도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제 요가의 날'에 한없이 삐딱하기만 한 네루 대학교 학생들의 냉소와 비아냥거림에 마냥 수긍하지만은 않는 것이다. 당장 그들부터가 날이 선 이론서만 읽고 뾰족한 논리만 세울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고 잡념을 덜어내는 몸 쓰기 기술도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듯한 몸, 가지런한 마음을 다지는 방법이 그토록 가까이 있건만, 등잔 밑이 어둡다. 그리하여 小學(소학)와 小乘(소승)에 그쳤던 지난날의 요가도 아니고, 힌두 국가의 국책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국풍 요가도 아닌, 大學(대학)과 大乘(대승)에 값하는 요가로 진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장차 요가의 재탈환, 재인도화를 가늠해보는 유력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주목되는 20세기의 요기가 있다. 스리 오로빈도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을, 오로빌도 있다. 오로빈도의 사상을 받드는 세계인들이 꾸려가는 '지구촌'이자 '미래촌'이다. 심신단련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인 정치와 경제를 실험하는 창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인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었다. 당장은 오로빌로 직행하지 않기로 한다. 조금 더 묵혀서 인도 견문의 대미로 삼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아직은 해야 할 얘기들이 산적하다. 그간에는 '힌두 민족주의'로 상징되는 21세기의 최신 동향에 집중했다. 이제는 20세기 현대사로 진입한다. 남아시아의 전쟁과 분단을 회감해 본다. 동아시아에 결코 못지않았다.
[유라시아 견문] 인도양 : 제국의 흥망성쇠
인도가 일본에 먹혔다면, 역사가 바뀌었다!
제국의 폐허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 영국은 승전국이었다. 그러나 무색했다. 대영제국은 해체되었다. 인도부터 떨어져나갔다. 인도는 대영제국의 기틀이었다. 최대 식민지 인도 없이는 대영제국이 성립할 수 없었다. 인도를 정복했기에, 인도양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해가 뜨는 대일본제국만 파산했던 것이 아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했던 대영제국 또한 저물어갔다.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이었다는 기왕의 지배 서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점이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대영제국의 몰락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인도는 승자 편에 서 있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에 환호했다. 6년 전쟁을 마감한 것이다. 애초 원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다. 인도 총독부의 일방적 발표에 따른 것이었다. 1939년 9월 3일이었다. 일요일 하고도 저녁 8시 30분. 라디오를 통해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콜카타도 델리도 아니었다. 총독이 여름 휴가를 나던 산골 별장에서 별안간 발표한 것이다. 독일과의 전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유럽의 정황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대영제국의 일부, 아니 중추였다. 단 한 명의 인도인과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인도 역시 전쟁의 화마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1939년 당시 인도군은 20만이었다. 1945년에는 250만이 되었다. 유명무실했던 공군도 300명의 장교와 9개 비행부대를 보유한 대군으로 성장했다. 해군 또한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전투함과 잠수함도 보급되었다. 총력전 체제에 총동원되었다.
이들이 인도만 보위한 것도 아니다. 해외 파병이 더 많았다. 서쪽으로는 아리비아 해와 홍해, 지중해를 건넜다. 동쪽으로는 벵골 만과 남중국해를 지났다. 그래서 종전 소식을 접한 인도 군인들은 북아프리카와 남유라시아 도처에 깔려 있었다. 홍콩, 싱가포르, 말라야, 미얀마,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집트, 튀니지, 시실리, 로마에서 독일과 일본의 패망 소식을 접했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지중해 일대는 '인도군의 호수'라고 빗대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인도군이 파병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영제국의 깃발 아래 전투를 수행한 이의 8할이 인도군이었다. 그래서 무슬림 출신들은 승전 포상을 겸하여 인도로의 귀환 길에 메카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인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인도양의 동과 서는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다. 양대 전선을 분주하게 오고갔던 인도인 장교들도 적지 않았다. 북방의 몽골만큼이나 남방의 인도에 착목함으로써 '유라시아 전쟁'의 면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제국의 건설
실은 대영제국의 건설에서부터 인도군의 공로는 혁혁했다. 세포이 항쟁(혹은 제1차 인도 독립 전쟁) 진압 이후 동인도회사를 대신하여 영국이 직접 인도를 통치했다. 그 영국령 인도는 무굴제국에 가탁한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무굴제국은 무슬림 지배층(관료+군인)에 힌두 기층 사회가 병존하는 구조였다.
대영제국은 군사력과 경찰력을 무슬림에 의존하여 인도를 분리 통치했다. 특히 전사의 심장을 가진 '몽골화된 무슬림', 혹은 '이슬람화된 몽골'의 후예였던 펀자브와 카슈미르 등 서북 변경지대에서 군인들을 징집했다. 소수파였던 무슬림과 시크교도들이 군대에서만은 다수파였다. 그들이 총독부의 안위를 보위하는 파수꾼이 된 것이다.
이들은 대영제국의 확산과 팽창에도 첨병 노릇을 했다. 제국의 전위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자바, 말라카, 페낭, 싱가포르, 홍콩과 상하이, 티베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 처음에는 군인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정복이 완료되면 경찰과 헌병 역할을 했다. 동아프리카의 수단에서는 농민 봉기를 진압했고, 동아시아의 중국에서는 의화단 운동을 분쇄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도 인도군은 대거 파병되었다. 170만의 대군이 아대륙을 떠나 프랑스와 벨기에, 갈리폴리,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메소포타미아, 아덴만, 홍해, 동아프리카, 페르시아에서 맹활약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오스만제국이 붕괴하자 인도군은 재차 투입되었다. 해양 제국 영국과 대륙 제국 러시아가 오스만 이후의 지배권을 두고 경합하는 '그레이트 게임'에 차출된 것이다. 70만 인도군은 이라크를 점령하여 영국에 헌사했다. 1920년 이라크에서 대규모 무장 항쟁이 일어나자 영국은 재차 인도군을 소환하여 이들을 진압시켰다.
이웃한 이란 역시 '그레이트 게임'의 관건적인 장소였다. 영국은 대륙형 적색 제국이 오스만제국을 대체할 것을 염려했다. 이란의 북부는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소련이 남하하면 영국령 이란의 석유 지대마저 위험해진다. 나아가 페르시아 만 국가들과 이집트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즉, 소련의 남하가 초래할 구 오스만제국 영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굴제국의 후예들을 활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까지 중동에 상시 주둔하던 인도군의 숫자는 1만을 훌쩍 넘었다.
유전 지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군을 활용하는 대영제국의 전략은 인도의 전통적인 외교 안보 정책과도 합치하는 것이었다. 인도사의 변동은 대개 서북 발(發)이었다.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이 아대륙과 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정치적 변동을 촉발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었던 영국령 인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친영 정권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일이었다. 이곳에 적대적인 정권(=친소 정권)이 들어서면 인도와 아랍 간 육로와 해로도 막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의 남부를 지배한 것도 인도군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친영 정권을 막후 지원한 것도 인도 총독부였다.
따라서 대국적 견지에서 보자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 그쳤다고만 말하기가 힘들다. 제국의 협력자이자 공모자였으며, 나아가 스스로 '하위 제국'이기도 했다. 인도양이 '영국의 호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제국 혹은 준제국으로서 인도가 풀가동되었기 때문이다. 무굴제국은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대영제국 아래서 존속했으며,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대영제국의 군사망과 경찰망의 호위를 받으며 인도인 자본가들도 무굴제국 시대보다 더 널리, 더 멀리 진출할 수 있었다. 제국망의 중간 기착지이자 상업망의 중심지였던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랭군, 나이로비, 카이로, 바그다드, 테헤란 등등 각지의 지역 경제에서 인교(印僑)들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제국의 보위 없이 혈연과 지연으로 살 길을 개척했던 화교(華僑)들과는 처지가 딴판이었다. 동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의 각종 인프라 건설 또한 인교들이 담당했다. 곳곳에 세워진 고무와 커피 농장 등에서도 남인도 출신 타밀 인들이 생산대의 핵심이었다, 대영제국이 흥망성쇠 하던 100여 년 동안 인도양의 동과 서로 진출한 인도인들의 숫자는 자그만 치 3000만 명에 달한다. 그 중에 영국에서 공부하고 남아공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간디도 있었던 것이다.
'아제국'의 위상은 영국령 인도가 베르사유 조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국제연맹의 창립 국가 자격까지 얻었다. 실제로 인도 총독부는 20세기 초반부터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중동 일대의 재정 정책까지 관여했다. 런던의 하수인이 아니라 영국과 더불어 '제국의 사명'에 적극 동참했던 것이다.
영국에 협력했던 인도인들에게도 전혀 낯선 업무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인도양을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평양도 대서양도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따지는 않는다. 오로지 인도양만이 '인도의 바다'라고 불린다. 대영제국 산하 영국과 인도를 제국과 식민지로만 갈음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섣불리 일본과 조선/대만에 견주어서 '비교 연구'를 해서는 몹시 곤란하다. 대국이 소국을 삼킨 것과 소국이 대국을 거느린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역동성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혹시 일본 열도보다 더 광활했던 만주국이 조락하지 않고 강건하고 강성해졌다면 '동경'과 '신경'(현재 장춘)의 관계가 런던-콜카타/뉴델리와 흡사하게 전개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영제국의 전성기, 콜카타와 델리는 런던을 잇는 제국의 제2도시, 제3도시로 영화를 구가했다. 델리의 영향력은 중동까지, 콜카타의 입김은 동남아까지 미쳤다.

▲ 대영제국의 전쟁 포스터. ⓒwikimedia.org
![▲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623/art_1465238816.jpg)
▲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
![▲ 이탈리아 로마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623/art_1465238852.jpg)
▲ 이탈리아 로마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
![▲ 프랑스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623/art_1465238885.jpg)
▲ 프랑스의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
제국의 수호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의 의미 또한 인도의 입장에서는 남달랐다. 대영제국을 수호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첫 번째 임무는 북아프리카였다. 인도군 1대대와 4대대가 파병되어 이탈리아와 대적했다. 유럽 전선은 비관적이었다. 개전 6주 만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줄줄이 무너졌다. 연합국과 대영제국의 반등 또한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사막 전투에서 인도군이 이탈리아군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대역전이었다. 초반에는 에티오피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탈리아가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수단까지 치고 내려왔다. 나아가 소말리아까지 진출했다. 동아프리카마저 이탈리아의 수중에 넘어가고 있었다.
동아프리카는 인도양의 서쪽이다. 지중해와 홍해가 이어지는 곳이다. 대영제국에도 사활적이었다. 이곳이 추축국에 넘어가면 대영제국의 숨통이 끊어진다. 영국과 인도, 상위 제국과 하위 제국의 연결망도 차단된다. 충격과 공포에 빠진 윈스턴 처칠이 긴급 타전을 한 것도 인도였다. 즉각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애원복걸에 가까웠다.
인도군은 뭄바이(당시 봄베이)에 집결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징집되었다. 난생 처음 바다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터번을 벗고 철모를 쓰라는 영국 장교들에 저항하는 시크교도들의 소란도 일었다. 그들이 전투함을 타고 아라비아 해와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중동 사령부에 합류했다. 망망대해의 절경에 탄성하던 기쁨은 하루 이틀 사이에 사라졌다. 3주가 걸린 바닷길 여정은 지겨운 노릇이었다. 배 멀미도 지독했다. 워낙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기에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 시설도 형편없었다. 상당수의 병사들은 탈진 상태로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다행히 독일의 유보트가 출격하여 이들 전함을 격침시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내 이집트와 수단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군의 잠수함이 아니라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전투기였다. 당장 폭탄이 투하되지는 않았다. 배 위로 떨어진 것은 삐라였다. 펀자브어와 힌디어와 영어가 빼곡했다.
2시간 후부터 폭격이 시작될 것이니, 대영제국을 위해 헛되이 목숨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도망가거나 투항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십중팔구는 대영제국을 위하여 싸웠다. 그리고 끝내 승리를 거두었다. 희생이 막대했다. 사막에서 전개되는 탱크 전이 낯설었다. 이탈리아 공군에 대적할 포격 부대도 없었다. 엎치락뒤치락 대혈투 속에서 인해전술로 맞섰다.
이탈리아 다음은 독일이었다. 전장은 홍해 건너 중동이었다. 독일군이 동남진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 인도군 역시 이라크와 이란으로 더 멀리, 더 깊이 진출했다. 일단 이라크에서는 석유가 났다. 전쟁 수행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모술과 키르쿠크의 유전을 인도군이 관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뽑아 올린 석유가 팔레스타인의 하이파 항과 시리아의 트리폴리를 지나 운반되었다. 이라크의 바스라 항도 중요했다. 이란의 유전과 연결되는 항만이었다. 바그다드와 바스라 근방에 자리한 공군 기지 또한 영국과 인도를 잇는 하늘길이었다. 카라치(현재 파키스탄)에서 출항한 인도군이 바스라까지 닿는 데는 보름가량이 걸렸다.
중동 대전의 성격은 미묘한 것이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범아랍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하며 대아랍 선전에 나섰다. 독일 또한 이라크를 중시했다. 대영제국에 저항하는 아랍의 근거지로 삼고자 했다. 민족 해방 운동과 결합하여 중동에서 대영제국을 분쇄시키려 한 것이다.
독일의 진격에 호응하여 내부에서 봉기하는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 라시드 알리(Rachid Ali) 같은 이가 대표적이다. 이 내외 합작을 발판으로 독일은 팔루자를 점령하고 모술의 유전까지 장악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송유관을 차단하여 대영제국의 기동력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독일과 아랍의 연합전선에 맞서 런던과 뉴델리 그리고 카이로의 합동 작전이 개시되었다. 주인공은 역시 인도군이었다. 바그다드를 재점령하고 바스라와의 연결망도 재건했다. 이라크 점령 사령관도 인도군이 맡았다. 인도군 10사단이 바그다드와 모술을, 8사단이 남이라크를 점거했다.
그러나 전혀 환대받지 못했다. 독일의 우산 아래 잠시나마 '해방'을 맛보았던 이라크인들은 대영제국의 재진출에 불만이 팽배했다. 인도군 앞에서 침을 뱉으며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라크인의 눈에 인도 군인들은 대영제국의 주구로 보였으리라. '무슬림 형제'의 배반으로 여겼을 법도 하다. 그 차가운 경멸을 견디며 인도군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는 날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라크 다음은 이란이었다. 한층 수월했다. 북쪽에서 소련이 합동 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영국-인도-소련의 협공으로 이란 역시 재탈환했다. 역시 이란인의 시각에서는 침공과 점령, 제국주의적 정복에 가까웠다. 그러나 인도 총독부로서는 이라크와 이란을 접수함으로써 서북 변경 지대를 안정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곧장 대영제국의 특별 훈장이 수여되었다. 인도군의 영웅적 모습이 대영제국의 미디어망을 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송출되었다. 본토에서도 호응이 컸다. 특히 파병 군인들이 많았던 펀자브 일대에서는 학교와 대학, 정부 기관이 휴일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었다. 라호르(지금은 파키스탄)에 집결하여 환호하는 당시 군중들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네루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진집과 더불어 살핀 인도의 제2차 세계 대전 자료 중에는 편지 모음집도 있었다. 제국의 공식 서사의 이면에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은 편지들이 인도양의 동과 서를 오고가고 있던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인 사이에 손 편지와 엽서가 폭증했다. 그 중 9할은 내가 읽을 수 없는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었다.
애틋한 사랑의 밀어를 나누고 있는 몇몇 영어 편지들을 통해서 추체험할 뿐이다. 바다로 격절된 거리감이 감정을 심화시켰다. 임의 부재가 사랑을 격화시켰다. 이 편지의 당사자 중 일부는 아름답게 뜨겁게 재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은 전장에서 숨을 거두었거나 실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부상병이 되어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았을지 모른다. 대영제국을 수호하는 아제국 인도의 기회비용이었다.
![▲ 봄베이 항에 집결한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623/art_1465238620.jpg)
▲ 봄베이 항에 집결한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
![▲ 이라크를 점령한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60623/art_1465238704.jpg)
▲ 이라크를 점령한 인도군. 인도 군부에서 2012년에 펴낸 [India and 2nd World War]에 수록된 것이다. ⓒ이병한
제국의 와해
제국의 붕괴는 동쪽에서 시작되었다. 동풍이 불었다. 일본이 남하했다. 일본/만주가 소련/몽골에 패함으로써 대일본제국의 북진이 봉쇄되었다. 활로를 남쪽에서 찾았다. 명분도 있었다. 유럽의 제국주의를 타파한다고 했다. 사상과 철학도 보태었다. 세계사의 철학, 세계 최종 전쟁 등 전시 담론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동시다발 폭격이 시작된 것은 1941년 12월이다. 진주만과 홍콩과 싱가포르와 말라야가 화염에 휩싸였다. 대동아 공영권이 발진함으로써 대영제국의 하부 조직은 하나둘씩 붕괴되었다. 냉전기 중국 공산주의의 남하라는 '도미노 이론'의 공포는 명명백백 제2차 세계 대전기 일본의 파죽지세에 기원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미는 전율했다. 대동아전쟁의 발발로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인도의 간디는 절망했다. 비폭력이 통용되지 않는 아수라장의 확산과 심화에 크게 낙담했다.
영국의 조지 오웰은 냉철했다. 펜을 들어 대영제국의 와해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일본의 동남아 진출과 미국의 참전으로 대영제국의 해체는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고 여겼다. 나아가 인도의 운명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일순간에 인도가 전쟁의 중심, 아니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유럽 전선과 아시아 전선의 공동 운명을 인도의 향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타개책을 구하는 것은 사상가, 지식인들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네루가 앞장섰다. 그 또한 대영제국 몰락의 서막이 열렸다고 생각했다. 영국은 이제 2등 제국이라고 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중국이었다. 중화민국과 연합하여 항일 전쟁을 수행하고,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
장제스를 인도에 초청하여 간디와의 회동을 주선했다. 1942년 2월, 간디와 장제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가 두 사람의 회동을 주목했다. 인류의 3분의 1을 대표하는 양대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5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는 퍽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간디는 여전히 군자보다는 성자였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군인 장제스 앞에서 비폭력 사상을 설교했다. 장제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꼈다. 그 심정을 다음날 아침 일기에 써두었다. 간디는 오로지 인도만을 생각하고, 인도만을 사랑할 뿐이다. 다른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신의 철학만을 고집할 뿐,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기록했다. 장제스가 간디를 성토하는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간디는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의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중국-인도의 항일 연합 노선이 무산되면서 네루와 장제스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했다. 태평양 건너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타진했다. 현실 정치인이었던 두 사람 모두 영국에서 미국으로 힘이 옮아가고 있음을 직관했다. 동남아에서 대영제국이 무너지는 힘의 공백을 대동아 공영권이 접수해가는 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미국을 꼽은 것이다.
네루와 루스벨트 간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는 에드가 스노우이다. <중국의 붉은 별>(홍수원, 신홍범, 안양노 옮김, 두레 펴냄)을 써서 중국공산당의 대장정을 세계에 알린 바로 그 사람이다.
스노우는 1931년에 이미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간디의 불복종 시민 운동을 대서특필한 이도 그였다. 인도가 제2차 세계 대전의 핵심 장소가 되자 그는 재차 인도 특파원을 자청했다. 현장에서 승부를 거는 타고난 언론인이었다. 그가 인도에 도착한 것이 1942년 4월이다. 두 달 전 2월에는 루스벨트를 직접 만나 네루에게 전하는 구두 전갈까지 받았다.
스노우는 인도를 주유하며 간디와 네루는 물론 인도 총독부의 영국 고위 인사들까지 두루 만났다. 인도가 일본에 점령되면 중국과 중동 또한 일본과 독일에 넘어가게 된다며 미국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는 기사도 연달아 송고했다.
실제로 1942년부터 동인도 연안에 일본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스노우가 콜카타에 도착한 날, 일본 해군은 바다 건너 실론(현 스리랑카)의 콜롬보를 점령했다. 영국 전함을 격파하고 군항을 파괴했으며 해양 보급로를 차단시켰다. 실론은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영국과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가 연결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대일본제국이 대영제국의 동쪽 연결망 전체를 장악한 것이다.
콜롬보를 접수한 후에는 인도 폭격도 본격화되었다. 마드라스(현 첸나이)와 콜카타에도 폭탄이 떨어졌다. 주요 도시와 해안가에 시체가 널리기 시작했다. 동부 연안 도시의 주요 기관들은 황급히 봄베이(현 뭄바이)등 서부 도시로 이동했고, 대도시의 주민들은 고향과 시골로 피난 갔다. 배와 기차와 버스는 피난민 행렬로 만석이었다. 은행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아비규환을 이루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으며, 식민지 도시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거지들마저 거리에서 말끔하게 사라졌다.
홍콩과 싱가포르, 실론 점령보다 더 충격적인 사태는 미얀마였다. '버마'라는 이름으로 영국령 인도에 포함되어 있던 곳이다. 10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 절반은 버마에서 태어났을 정도로 동인도와 미얀마는 한 몸이었다. 곧장 아삼과 벵골로 이어지는 접경지이기도 했다.
일본 육군이 대영제국의 제2도시였던 콜카타로 진격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다. 불안과 공포가 인도인의 심리를 잠식해갔다. 총독부의 언론 통제와 검열도 속수무책이었다. 동남아와 동인도 사이의 인교 네트워크로 대영제국의 몰락 소식이 시시각각 가족과 친족과 마을로 전해졌다. 속속 밀려드는 전쟁 난민과 부상자들 또한 전황의 실상을 말해주었다. 점점 전쟁의 그림자가 인도 본토를 뒤덮어갔다. 흉흉한 민심에 소문과 괴담 또한 무럭무럭 자라났다.
1942년, 대영제국에 대한 인도인의 심리적 이탈은 결정적이었다. 식민지에서도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일정하게 통하기 마련이다. 최소한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지배 체제가 작동한다. 1942년을 기점으로 영국은 다시는 인도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영제국에 대한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인도인들의 마음이 인도 총독부에서 완전히 멀어져간 것이다.
국민회의 또한 더 이상 대영제국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인도를 떠나라(Quit India)'를 선언한다.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인도 총독부는 전시 협력을 거부하는 국민회의 지도부를 모조리 연행했다. 그럼으로써 더더욱 인도와 영국의 분리는 심화되었다.
대영제국은 내파되어 갔다. 즉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일본의 충격'이 인도의 독립에도 기폭제 역할을 했음을 전연 부정하기가 힘들다. 대일본제국이 대영제국을 침몰시켰고, 그 대일본제국을 소련과 중국, 미국이 해체시켰다. 인도양에서는 대영제국이, 태평양에서는 대일본제국이 붕괴하면서 제국주의 시대도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다.
제국의 유산
1946년 9월,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임시 정부 총리로 네루가 선출되었다. 취임 일성이 흥미롭다. 인도를 잠재적인 강대국이라 했다. 신생 조직인 유엔(UN)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도는 아시아와 인도양, 특히 중동과 동남아의 안보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도가 아시아 안보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100년에 못 미쳤던 인도 총독부가 사라진 것은 1947년이다. 영국은 떠났지만 아제국, 하위 제국으로서의 인도는 여전했다. 대영제국의 아류였다는 뜻이 아니다. 인도는 인도만이 아니라 인도양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발상이 이어졌다는 말이다. 인도의 고유 브랜드인 비동맹 외교의 기저이다.
인도의 비동맹이 가치가 있었던 것도 인도가 특정한 편을 들었을 때 세계사의 축이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러하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접속하는 해양 동맹으로 인도를 유혹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동맹으로 인도를 끌어들이려 한다.
유라시아와 인도양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인도의 선택이 20세기만큼이나 21세기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도의 선택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에까지 큰 파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인도양은 변함없이 '인도의 바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견문] 수바스 찬드라 보스 : 남국의 열혈남아
인도의 진짜 독립 영웅은 간디가 아니다
도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대영제국의 위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다고 인도인의 마음이 국민회의로 쏠렸던 것도 아니다. 1942년 '인도를 떠나라(Quit India)' 운동 이후 국민회의는 유명무실했다. 간디와 네루 등 지도부가 수감되면서, 사실상 활동 중지 상태였다. 종전 당시 인도인들의 영웅은 국민회의가 아니라 인도국민군이었다.
대영제국에 협력하며 유라시아를 동분서주했던 그 인도군(Indian Army)이 아니다. 그 반대편에 섰던 이들이다. 그래서 최초의 '국군(India National Army)'이기도 했다. 대영제국에 무력으로 도전했던 또 다른 군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미얀마를 거쳐 벵골로 진입해 콜카타를 점령하고자 했다.
대영제국과 대일본제국이 최후의 일합을 다투었던 임팔 전투에서도 일본 편에 섰다. 종전 직후 인도 총독부는 이들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다. 장교 300명을 반역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인도 민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들이야말로 인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민족 영웅이라며 총궐기한 것이다. 총독부는 인도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결국 전원이 석방된다. 영국이 더 이상 인도를 통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 인도국민군의 지도자가 수바스 찬드라 보스이다. 인도의 제2차 세계 대전사를 복기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40도를 넘어 50도까지 치오르는 남국의 열기를 뿜어냈다. 격정적이고 격렬했다. 감정적으로 가장 몰입되었다.
그는 1897년, 벵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영국식 법치를 인도에 이식하는 식민지 엘리트였다. 그러나 악질 친영파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인도인을 위한 인권 변호도 했다고 한다. 보스는 자신의 삶에 부친의 영향이 컸다고 회고했다.
그는 소싯적부터 총명했다. 인도 최초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콜카타 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특유의 다혈질은 대학 시절부터 불을 뿜었다. 영국인 교수들의 인종 차별에 반발하여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 주동자로 정학 처분도 받았다. 겨우 학사를 마치고는 제국의 본산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특히 근대 유럽의 국제 관계를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군사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친구들이 주권재민과 법치주의와 의회제와 국제법 등의 '선진성'을 달달 외고 있을 때, 그는 근대 국가=군사 국가라는 본질을 직시했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모범생이 아니었다. 자기 주도로 학습했다.
그래도 인도 고등문관시험에는 응시했던 모양이다.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런데 식민지 지배의 하수인이 되는 길이라며 자격을 반환했다고 한다.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2차 자격 고사인 승마 시험에 떨어졌다는 설이 있다. 아무래도 후자가 사실이지 싶다.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는 기억의 왜곡은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스처럼 유명한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빈번한 일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로써 보스의 인생은 크게 갈렸다. 식민지 관료는커녕 그 반대편,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인도로 귀국한 것이 1921년. 곧바로 국민회의에 투신했다. 출중한 능력에 개인적 매력까지 발산하며 1927년에 국민회의 사무총장에, 1930년에는 콜카타 시장에 취임한다. 앙팡 테리블, 30대부터 거침없이 출세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러나 유독 간디와는 합이 맞지 않았다. 비협력과 불복종의 유효성에 회의를 품었다.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위대한 철학일지언정, 현실의 국제 정치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영국이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인도 또한 무력에 의해서만 독립할 수 있다고 했다. 양자의 불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1930년대부터 보스는 독자 노선을 걷는다. '30대 기수'의 전위에 섰다. '전진동맹'을 결성하여 국민회의 내부의 좌파, 급진파로 세를 키워갔다. 1938년에는 국민회의 의장까지 거머쥔다. 마흔 남짓에 인도를 대표하는 정당의 당수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간디가 아량을 베풀었다. 노선 투쟁 격화를 우려하여 보스를 의장으로 세운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민회의는 1인 지배 정당에 가까웠다. 간디가 지명하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그래서 1936년과 1937년에는 네루가 연임할 수 있었다. 간디가 네루의 후임자로 보스를 낙점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권을 쥐자마자 보스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 취임 연설부터 영국에 대한 최후통첩 의사를 밝히며 독립 노선을 강화했다. '인도 독자의 사회주의'도 제창했다. 동시대 소련과 독일, 이탈리아의 약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청년, 농민, 빈곤층의 지지가 상당했다.
그러나 간디는 우려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적대적이었다. 소련이나 독일에 접근하기보다는 대영제국의 품에서 자치를 확대해가는 편이 낫다고 여겼다. '사회주의적 근대화'에도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주지하듯 간디는 근본주의자였다. 산업화와 근대 문명 자체에 비판적이었다. 자립 경제와 마을 자치만이 인도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간디와 보스의 불화는 노선차이라기보다는 기질 차이가 더 컸다. 네루 또한 소련식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다. 다만 네루는 간디에 고분고분했다.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는 편이었다. 대장정 이후 마오쩌둥처럼 소금 행진 이래 간디는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누렸다.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 네루 또한 자신을 간디의 충복이자 후계자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보스는 달랐다. 자신만만하고, 야심만만했다. 기개가 넘쳐흘렀다. 스스로를 간디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일흔 꼰대가 아니라 40대 젊은 피가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39년 의장 선거에서 양자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간디가 추천하는 후보와 보스가 표 대결을 펼친 것이다. 의장 선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차세대의 도전이자 당내 민주화 운동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최대 주주로 전권을 행사하던 간디의 뜻을 꺾고, 일반 당원의 지지를 얻은 보스가 크게 이긴 것이다.
간디는 곧장 보스의 승리를 자신의 패배라고 선언했다. 보스로서는 치명타였다. '보스=반(反) 간디'의 프레임을 발신하는 불신임 표명이었기 때문이다.
간디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간디 추종자들의 보스 흔들기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친간디 패권주의가 횡행했다. 결국 당선 3개월 만에 의장직을 사임한다. 사실상의 낙마, 쫓겨난 꼴이다. 심지어 3년간 당직 보류 처분까지 받는다.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만은 보스도 간디에 못지않았다. 오뚝이처럼 일어난다. 다만 더 이상 당내 쇄신과 정풍 운동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백의종군했다. 당 밖에서, 인도 밖에서, 새 길을 찾았다.

▲ 간디와 보스. ⓒwikimedia.org
탈출
1939년 9월,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보스는 솔깃했다. 그토록 고대해마지 않던 대영제국의 난국이 닥쳤다며 환호했다. 인도가 독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 줄을 이었다.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었다고 했다. 독일 전차 부대의 영국 상륙이 임박했다고도 했다.
인도 역시 때를 맞춤하여 무장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여겼다. 국민회의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여전히 간디였다. 그의 거처를 찾아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간디는 거절했다. 그러기는커녕 영국을 도와 파시즘을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보스는 간디의 독선(獨善)에 깊이 절망했다.
게다가 1940년 7월 또 다시 투옥된다. 인도 총복부가 보스의 봉기 낌새를 포착한 것이다. 이번만은 보스가 간디를 따랐다. 간디처럼 죽자 살자 단식 투쟁에 나섰다. 보스 역시 두 차례나 국민회의 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옥중 아사는 총독부로서도 난처한 사태였다. 결국 가택 연금으로 방침을 바꾼다. 그 틈을 이용하여 대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콜카타의 자택을 떠난 보스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파슈툰 족으로 분장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수염도 길렀다. 파슈툰 족은 오늘날 파키스탄의 서북부와 아프가니스탄의 동남부에 살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파슈툰 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경찰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귀머거리, 벙어리 시늉을 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련이 가까웠다. 소련령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외교관으로 변신했다. 여권도 위조했다.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당시만 해도 보스는 소련만이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념적으로도 친근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냉담했다. 보스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영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할 뜻이 조금도 없었다.

▲ 히틀러와 보스. ⓒwikimedia.org
결국 그의 최종 목적지는 베를린이 된다. 1941년 4월 2일에 도착했다. 나치 독일이 절정을 구가할 때였다. 북해부터 지중해까지, 대서양부터 흑해까지 히틀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며칠 후에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럽 전체가 독일 휘하에 들어가고 있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 영국령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있다고 했다.
보스의 눈앞에서 19세기와는 전혀 다른 신세기가, 20세기가 펼쳐지고 있던 것이다. 그가 파시즘에 우호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역시 또 다른 제국주의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력만큼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 힘을 한층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도와 아시아/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고무되었다.
보스는 전심전력으로 독일을 설득했다. 거듭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일 외교부에 타전했다. 추축국과 인도의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서북 지역으로 진출하면 내부에서 인도인들이 봉기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화된 5만 군대만 있으면 인도 탈환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인도 망명 정부 수립과 서북 변경 지대의 부대 창설을 요청했다. 혹여 인도에서 영국이 건재하다면, 언제든 기력을 회복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독일의 신질서와 인도의 운명은 불가분이라며 힘주어 역설했다.
75년 전 보스의 보고서는 흥미진진했다. 빨려 들듯 읽어갔다. 유라시아 전체의 판세를 읽는 통찰이 번뜩였다. 대영제국의 심장인 인도를 정복해야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민중들이 추축국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허황한 말이 아니었다. 광대한 제국을 경영하고 있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환호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다. 독일과 인도 사이에는 소련이 있었다.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보스가 전망한 독일의 인도 진출 또한 소련의 묵인 아래 가능한 것이었다. 혹은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대영제국을 분쇄하는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독일과 소련은 합작은커녕 서로가 서로를 소진시키는 육박전에 들어갔다. 독-소전, 제2차 세계 대전 최대의 지상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 소식에 보스는 좌절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인도 민중들도 나치 독일을 지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전도유망한 정치인들이 그러하듯 보스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 같기도 하다. 무솔리니와 회동하고, 히틀러와도 접견했지만 그는 일개 망명객에 불과했다. 대등하게 전술 전략을 논할 처지가 아니었다. 히틀러는 대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자신은 당신과 같은 선전 선동가가 아니라 군인이라며, 인도 해방은 소련군의 시체를 밟고 난 후에나 가능하다며 역정을 냈다.
실은 히틀러는 속 깊이 아시아인을 멸시했다. <나의 투쟁>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바, 아시아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영국이 인도를 떠난다 해도 20년이 못되어 다시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장 인도 자유 정부를 승인해달라는 보스가 성가셨을 것이다. 소련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서둘러 자리를 파했다. 다만 라디오 방송국 설립만은 지원해주었다. 독일이 침략국이 아니라 해방군이라는 선전용으로 보스를 활용했다.
그럼에도 보스는 방송에 사력을 다했다. 심혈을 기울여 원고를 작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곧 추축국이 대영제국을 해체시킬 것이다. 대영제국을 사수하는 국민회의를 따라서도 안 된다. 즉각 무장 봉기 조직을 만들어 추축국과 협조하여 인도를 해방시켜야 한다. 영국은 결코 인도를 독립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분할 지배를 획책하여 인도를 여럿으로 쪼갤 것이라며 (정확하게) 예측했다. 영국이 떠난 자리는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미얀마로 사분오열 되었다. 냉전기 남아시아는 항상적인 준전시 상태, 대분할 체제였다.
독일의 원조를 통한 인도 독립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아프리카와 중동 전선에서 영국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재역전해갔다. 역설적으로 뭄바이와 카라치에서 출항한 인도군의 공헌 때문이었다. 보스의 구상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반등의 계기가 열린다. 이번에는 유라시아 동쪽 끝이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나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대영제국의 동쪽 날개가 무너지고 있었다. 보스는 더 이상 유럽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베를린을 떠났다. 도쿄로 향했다.

▲ 도조 히데키와 보스. ⓒwikimedia.org
돌격
콜카타에서 베를린까지는 유라시아의 육로를 이용했다. 베를린에서 도쿄까지는 인도양의 해로를 따라갔다. 히틀러가 선심을 써주었다. 당대 최강 독일 잠수함을 태워준 것이다. 1943년 2월 8일, 보스는 U-180을 타고 프랑스 서북 해안에서 출항했다.
마다가스타르 섬에 도착한 것이 4월 26일이다. 여기서 일본 해군의 잠수함으로 갈아탄다. 수마트라 항에 도착한 것은 5월 6일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네덜란드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 보스는 장차 인도네시아의 초대 수상이 될 수카르노와 회동했다.
동북아와 동남아의 하늘길은 일본이 접수한 상태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길은 한결 수월했다. 전투기에 탑승하여 도쿄에 도착한 것이 5월 16일이다. 꼬박 100일이 걸렸다.
도조 히데키를 만난 날은 6월 12일이다. 보스는 재차 무장 투쟁을 통한 인도 독립을 역설했다. 히틀러와 달리 도조는 호의적이었다. 보스의 사람됨에 찬사를 표했다. 남자 중의 남자, 상남자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6월 16일 대일본제국 내각회의에 특별손님으로 초청된다. 그 자리에서 인도독립연맹 총재이자 인도국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일본-인도 연대가 공식화된 것이다.
보스는 더 치고 나갔다. 10월 2일 자유인도 임시정부를 선포한다. 본인이 임시 수반으로 외교와 전쟁 업무를 총괄했다. 초대 임시내각 11명 가운데 8명이 인도국민군 장교로 구성되었다. 전시 내각 격이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 9개국이 승인했다. 보스는 인도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영국에 정식으로 전쟁도 선포했다. 11월에는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회의에도 참석하여 일장 연설을 펼쳤다.
인도국민군의 본거지는 일본 점령 하의 싱가포르였다. 보스는 특유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인도국민군을 직접 모집했다. 동남아시아 전선에 인도군으로 파병되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이들을 집중 포섭했다.
영어와 힌디어로 번역된 보스의 연설이 동남아 곳곳에 퍼져나갔다. 일본군은 여러분을 전쟁 포로로 여기지 않는다.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모든 아시아인들의 해방을 원한다. 그래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인도 해방을 지원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적극 회유하고 권장했다.
효과도 상당했다. 보스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국민회의 의장 출신이었다. 싱가포르에서만 전쟁포로 6만5000명 가운데 2만 명이 인도국민군에 참여했다. 보스는 이들을 세 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부대의 이름을 간디, 네루, 아자드(Azad)라고 지었다. 아자드는 자유라는 뜻이다. 10월 2일에는 인도국민군의 가두 행진도 펼쳐졌다. 10월 2일은 간디의 생일이다. 여기서 인도국민군이 불렀던 군가는 훗날 독립인도의 애국가가 된다.
보스는 이들을 이끌고 미얀마(당시 버마)의 랭군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아웅산과도 조우했다. 이들은 일본군과 함께 임팔 전투에 앞장섰다. 보스는 영국군의 저항을 뚫고 벵골에 진입하면 동인도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내 콜카타를 점령하면 일생 그의 무장 투쟁 노선을 반대했던 간디 선생도 기뻐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평생의 숙원 달성이 목전에 달한 듯 했다. 커다란 착각이었다.

▲ 일본 잠수함의 보스. ⓒwikimedia.org
의혹
대일본제국의 파산과 함께 보스의 소원 또한 산산이 조각났다. 목숨까지 잃었다. 패전이 임박하자 그는 소련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만주로 갈 작정이었다. 영국, 미국보다는 소련이 자신의 안위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만에서 대련으로 향하는 전투기에 탑승한 것이 8월 19일이다. 현금과 보석이 가득 담긴 여행 가방 둘도 실었다. 또 다시 망명길에 오르는 보스를 위하여 동남아 인교(印僑)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다. 기구한 그의 운명에 눈물을 훔치는 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륙 직후 좌측 프로펠러가 떨어져나갔다. 본체는 바닥으로 떨어져 두 동강이가 났다. 폭발음이 일고, 화염이 뒤덮었다.
보스는 3도 화상을 입었다. 대만 육군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했지만, 무더위에 화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의 최후는 의연했다고 한다.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 여한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카레였다. 첫 숟갈을 뜨고 맛있다며 희미하게 읊조렸단다. 세 숟갈 째를 먹고는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8월 20일, 타이베이에 있는 한 절간에서 화장을 했다. 보스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8월 23일이다. 그의 유골 중 일부가 일본에 전해져 한 절(蓮光寺)에 보관되어 있다.
헌데 당시부터 그의 사망 진위 여부에 말이 많았다. 인도 총독부도, 연합국의 동남아 사령부도 일본의 발표를 믿지 않았다. 정황부터가 석연치 않다. 패전국이 된 일본(대만과 만주)을 경유하여 승전국인 소련으로 가려고 했다? 비행기에 동석했던 복수의 일본인들이 생존했다는 점, 인도 임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시베리아 등지에서 보스를 보았다는 증언이 속출했다는 점. 게다가 소련-인도 정상 회담의 비공개 만찬에서 흐루시초프가 네루에게 보스를 송환하겠다고 말했다는 통역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인도 정부로서도 외면만은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간 세 차례나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1956년, 1970년, 그리고 2006년이다. 처음 두 보고서는 대동소이하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며,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세 번째 보고서가 미묘하다. 위원회가 조직된 해가 1999년, 인도인민당(BJP)이 여당이었을 무렵이다.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다. 비행기 사고는 연합군, 특히 영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군이 꾸며낸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모셔진 유골 또한 보스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보스가 언제 죽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제출된 2006년에는 재차 국민회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국민회의 정부는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도국민군과 보스가 부각되면 될수록, 인도독립운동사에서 국민회의와 간디-네루가 누리던 독점적인 위상에 흠집이 가기 때문이다. 보스의 최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마하트마와 네타지
간디가 마하트마였다면, 보스는 네타지(नेताजी, Netāj)였다. 지도자, 혹은 총통이라는 뜻이다. 석연치 않은 죽음에도, 혹은 바로 그런 탓에 보스는 인도 민중들의 기억에 뚜렷한 이름을 새겼다. 현재 인도의 국회의사당에는 세 사람의 초상화가 있다. 간디와 네루 그리고 보스이다.
처음에는 둘만 있었다. 보스가 포함된 것이 1978년이다. 델리가 자랑하는 웅장한 레드포트에도 보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영국 국왕 조지 5세의 동상이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네타지가 꿰찬 것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네타지 스바스 공대도 있다. 실은 양곤에서 콜카타로 이동했던 작년 11월, 인도에 첫 발을 내딛은 곳도 네타지 스바스 찬드라 보스 국제 공항이었다.
그가 살았던 콜카타의 저택은 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할 때 사용했던 자동차도 구경할 수 있었다. 벵골에는 지금도 '전진동맹'이라는 정당이 있다. 인도공산당과 더불어 벵골 좌파의 양대 축을 이룬다. 동남아프리카의 인교들은 간디를 기억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인교들은 보스를 더 높이 기린다.
마하트마의 이상이 숭고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도덕의 재건, 영성의 진화를 도모했다. 세속화=근대화의 공식을 허물고 영성의 근대화를 추구한 선각자였다. 그러나 너무 앞서 가셨던 것 같다. 초역사적이고 탈역사적이었다. 그래서 인도다운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어진 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역사적 인물'도 필요한 법이다. 20세기 인도의 지상과제는 독립과 건국이었다. 무력의 수반 없이 새 나라가 세워진 바를 알지 못한다. '입(立)'의 전제는 '파(破)'이다. 인도 총독부, 대영제국은 타파되어야 했다. 20세기는 난세를 치세로 전환시키는 영웅들의 시대였다. 그런 점에서 보스는 미얀마의 아웅산,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신중국의 마오쩌둥, 북조선의 김일성, 이집트의 나세르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식민지 지배에 맞서 떨쳐 일어나 무장 투쟁을 펼친 '민족적 사회주의자'의 한 명이었다.
뭄바이에 머물고 있던 1월 말, 모디 총리는 전격적으로 보스와 관련된 비공개 문서 100점을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영국 총리였던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다. 영국이 인도를 포기한 것에 국민회의와 간디가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말했다. 보스가 조직한 인도국민군의 역할이 훨씬 컸다는 것이다. '국군'의 존재를 알게 됨으로써 인도군 또한 더 이상 영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실전 경험을 두루 익힌 인도군이 250만이었다. 이들이 '인도 국군'으로 각성하여 총독부로 총구를 돌려 총공격에 나서기 전에 서둘러 떠나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군사력이 미비했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영국은 더 오래 눌러 앉았다. 보스의 공이 그만큼 컸다고 하겠다.
장차 인도가 부상하면 할수록, 보스의 이름은 더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인도판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사는 물론이요 20세기사 전체의 재인식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간의 세계 대전사도 냉전사도 지나치게 '승자 중심'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다. 인도의 경험을 유력한 방편으로 삼아 20세기 유라시아사를 재구성, 재서술할 만하다.
영국이 황급하게 인도를 떠났다고 하여 대영제국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유산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 무책임한 방기야말로 파국을 한층 가중시켰다. 분단과 분할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에 버금가는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를 살펴볼 때이다.
[유라시아 견문] 1947 : 대분할 ①
20세기 최대의 분단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
파열
20세기 최대의 분단 국가는 남/북한도, 남/북베트남도, 동/서독도 아니다. 단연 인도/파키스탄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형제국이자, 세 차례나 전쟁을 치른 적대국이기도 하다.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인도는 13억, 파키스탄은 2억이다. 두 나라 모두 대국인데다, 핵무장 국가이기도 하다. 富國(부국)은 아닐지언정, 强大國(강대국)에는 모자람이 없다. 여기에 파키스탄에서 떨어져 나온 방글라데시도 1억을 넘는다. 남아시아가 대분할되지 않았다면, 인도는 진작 중국보다 훨씬 큰 나라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각조각 쪼개졌다.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간 분단의 기원을 찾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많은 역사가들이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오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1910년대와 1920년대에서 대분할 체제의 기원을 찾는 것은 지나친 독법이다. 더 이른 시기로 더 더욱 소급 적용해가는 것을 선호하는 역사학자들의 습속이 투영된 것이다. 허나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당시만 해도 1947년의 대파국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느닷없고, 돌발적인 사태였다고 하는 편이 더 합당하다. 역사는 인과 관계로 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때로는 필연보다 우연이 더욱 결정적이다.
두 차례의 선거가 기폭제였다. 일단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뼛속까지 제국주의자인 윈스턴 처칠의 시대가 황급하게 저물었다. 대영제국은 곧장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핵심은 인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식민지였고,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식민지가 되었다.
이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의 후폭풍이다. 대영제국의 깃발 아래 북아프리카의 사막부터 동남아시아의 정글까지 누볐던 인도군이 속속 인도로 복귀했다. 무려 250만이었다. 이들이 '최초의 국군', 인도국민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인도인들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인도 전역에서 반영(反英)주의와 군사주의가 고조되었다. 인도군이 인도국민군과 합세하여 인도 총독부를 겨냥하는 '제2의 세포이 항쟁', 혹은 '제2차 인도 독립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던 것이다.
공연한 상상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차이나에서도 복귀하는 유럽 제국에 대한 본토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탈식민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 대세였다 영국의 과제 또한 언제, 어떻게 인도를 떠날 것인가가 되었다. 영국을 '승전국'으로만 간주하기가 힘든 까닭이다. 잃은 것으로 치자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컸다.
네루를 포함한 국민회의 지도부가 석방된 것은 1945년 6월 14일이다.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한 달여가 흐른 뒤이다. 수감되었던 3년 동안 그들은 신문과 방송 등 일체의 외부 소식과 단절되어 있었다. 세계사의 급변 상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낯선 세계로 던져진 것이다.
그들이 부재했던 3년간, 인도의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당장 국민회의의 상징, 간디에 대한 신망부터 현저하게 떨어졌다. 인도 본토까지 전쟁의 참화가 미치게 되면서 비폭력주의의 무기력함을 확인한 것이다. 졸지에 구시대의 인물처럼 간주되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린 것은 간디가 아니라 보스였다. 보스가 국민회의를 접수하고 네루 대신에 초대 총리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스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중요하게는 무슬림연맹이 대약진했다. 1909년 창립한 이 조직은 국민회의의 기세에 눌려 좀처럼 세를 키우지 못했다. 그러나 전시 기간 국민회의가 없는 틈을 활용하여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200만 거대 조직이 되어 있었다. 다가오는 인도 총선 또한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무슬림연맹은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고 했다. 전후 인도의 운명을 가늠할 총선의 균열선이 좌/우, 보수/진보로 그어진 것이 아니다. 이념이 아니라 종교가 남아시아를 분할해갔다. 과연 정치는 기층 사회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분열
선거의 주도권도 무슬림연맹이 쥐었다. 이슈를 선점하고 프레임을 장악했다. 선거의 화두는 단연 '파키스탄(Pak-istan)'이었다. 파키스탄은 우르두 어이다. 우르두 어는 힌두 어와 페르시아 어의 혼종이다. 무굴제국의 공식어였던 페르시아 어에 북인도의 일상어였던 힌두 어가 섞인 것이다.
우르두 어로 Pak은 순수함을 뜻한다. istan은 장소라는 뜻이다. 순수한 장소, 순결한 땅을 의미한다. 영국(기독교)과 힌두교가 없는 무슬림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총선은 독립 인도를 준비하는 제헌의회 선거가 아니라, 파키스탄 찬반 지지를 묻는 국민 투표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무슬림연맹은 무굴제국의 영광을 상기시켰다. 이슬람제국이었다.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무굴제국의 복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주입한 민주주의가 복병이었다. 1인 1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 당시 인도의 무슬림 인구는 1억에 육박했지만, 4억 힌두에 비하면 소수자였다. 영국인에 이어 이제는 힌두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자존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촉발했다.
영국 총독부에서 힌두 총독부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출발부터 영국과의 합작 성격이 농후했다는 아픈 점을 마구 들쑤셨다. 국민회의를 대영제국의 아류이자 후계자에 비유하고, 간디와 네루를 처칠의 후예라고 폄하했다. 국민회의에 투표하는 것은 무슬림의 심장에 총을 쏘는 것이라는 과격한 수사도 등장했다.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는 종교적 선동도 가미되었다.
국민회의로서는 조국 인도의 분열을 용납할 수 없었다.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을 계승하는 '대 인도(Greater Mother India)' 건설을 포기할 수 없었다.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야말로 대영제국의 분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년 인도 독립 운동의 배반이라고도 했다. 세속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종교에 의한 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의 민족'론을 설파하는 무슬림연맹을 나치즘과 파시즘에 빗대기도 했다. 정녕 파키스탄이 분리된다면 내전이 불가피하는 엄포도 보태었다. 무슬림연맹은 곧장 되받아쳤다. 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다. 이슬람제국의 회복이야말로 탈식민의 완성이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이라 했다.
결국 선거는 유사-전쟁에 방불했다. 인도는 영국과 규모가 다르다. 선거 또한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장장 석 달이 걸렸다. 1945년 12월에 시작되어, 1946년 3월에야 마쳤다. 유세단들은 코끼리와 낙타를 타고 남아시아 전역을 누볐다. 양대 정당은 유권자를 최대한 동원하기 위하여 종교를 거듭 소환했다.
무슬림연맹은 코란을 인용했고, 국민회의는 힌두교 사원을 동원했다. 양당의 유세 현장은 멀리서도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모자부터 의상까지 복장부터 판이했다. 투표소 앞에서도 한 손에는 코란을, 다른 손에는 힌두교 경전을 들고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했다. 총선이 대통합보다는 대분열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 선거를 전후하여 인도는 힌두와 이슬람으로 확연하게 갈라졌다.
지역적으로는 북인도와 남인도가 분열되었다. 남인도에는 애당초 이슬람의 영향이 덜했다. 서북에서 진출한 이슬람은 대개 북인도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서쪽을 '이슬람적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인도에서는 북부가 '이슬람적 인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수도 델리 또한 북부에 치우쳐 있다. 서북 내륙에서 남하한 무슬림 유목민의 시각에서 델리는 유라시아와 인도 아대륙의 한복판이기 때문이다. 마치 몽골 유목민들의 관점에서 북경이 초원과 중원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북인도의 무슬림들은 점점 인도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세계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재규정해갔다. 선거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다. 서북과 동북 지역에서 무슬림연맹이 크게 승리한 것이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과에 힘입어 파키스탄 분리 독립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 무슬림연맹의 지도자 지나(Mohammad Ali Jinnah)의 초상화가 상징적이다.
백마를 탄 지나의 거대한 초상화가 북인도 주요 도시에 전시되었다. 명백하게 칼리프와 술탄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오스만제국의 해체(1916년)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만 알았던 이슬람 천년의 정치 제도가 북인도에서 재차 부활하는가 싶었다.
다만 파키스탄의 실체는 모호한 것이었다. 여러 지도들이 북인도 일대에 퍼져갔다. 한쪽에는 히말라야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아우른 '파키스탄 제국' 지도가 떠돌았다. 다른 쪽에는 벵골, 펀자브, 라자흐스탄 등 남아시아 곳곳에 산재하는 '파키스탄 주'를 표시해둔 지도도 있었다. 파키스탄을 구성하는 다섯 지역으로 펀자브(Punjab), 아프간(Afghan), 카슈미르(Kashmir), 신드(Sindh), 발루치스탄(Baluchistan)을 꼽아서 그 머리글자의 조합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때로는 가상이 실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파키스탄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인도의 파열을 증폭시켰다. 콜카타에서부터 힌두와 무슬림 간 폭동과 학살이 시작되었다. 표 대결 이후의 사생결단 싸움이었다. 힌두 무장 단체 민족봉사단(RSS)이 활약하기 시작했고, 무슬림 무장 단체 또한 지하드로 맞불을 놓았다.
나와 남의 분별이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격변하고 있었다. 구호 단체마저 양쪽으로 갈라졌다. 무슬림은 무슬림만 구하고, 힌두는 힌두인만 보호했다.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진입한 것이다. 범이슬람주의와 범힌두주의가 사납게 충돌했다. 해방 공간, 아힘사는 재차 아수라에 무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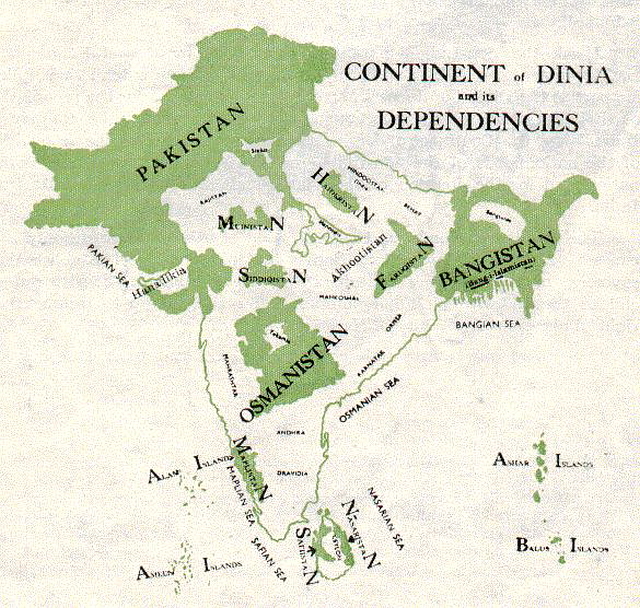
▲ 1947년 전후로 인도에서 발간된 지도 가운데 하나. ⓒ이병한
분단
서서히 달구어지던 인도 아대륙의 불안한 정국에 결정적인 기름을 끼얹은 것은 영국이다. 1947년 6월 3일,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는 인도/파키스탄 분할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한다. 인도 총독부가 철수하는 시점도 8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제국을 거두고 내정에 충실하라는 본국 유권자의 소망에 부응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민지 인도에는 폭탄을 투하한 꼴이었다. 불과 70여 일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분할시켜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촉박한 일정이었다. 국민회의도, 무슬림연맹도 태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애틀리 스스로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1948년 6월까지 총독부를 해산하겠다고 밝힌 것이 2월 20일이었다. 1년 이상 여유가 있던 분리 독립 준비 기간이 2달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은 서둘러 건국 작업에 돌입해야 했다. '시간과의 경쟁', 다급한 속도전이 분단의 파국을 한층 가중시켰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무슬림연맹은 무슬림이 다수인 모든 주를 파키스탄으로 삼는 '대(大)파키스탄'을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소(小)파키스탄'으로 응수했다. 관건은 벵골과 펀자브였다.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 귀속권을 주장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만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다. 벵골과 펀자브는 주 차원에서 동과 서로 분할되어 갔다. 펀자브는 무굴제국 시절 가장 번영했던 곳이다. 벵골은 대영제국 시기 가장 번성했던 장소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되면서 두 곳은 가장 참혹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당장 정부 기관부터 쪼개졌다. 공무원들도 갈라졌다. 특히 무슬림 출신 공무원들은 일생일대의 선택에 직면했다. 인도에 남을 것이냐, 파키스탄으로 갈 것이냐. 파키스탄에서 임시 수도로 지정된 곳은 카라치였다. 60만 항구 도시에 델리 출신의 이주자들이 속속 밀려들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설 붐도 일었다. 흡사 행정 수도 이전에 방불했다. 파키스탄의 이념과 이슬람의 이상을 구현하는 신도시 만들기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생활인들에게 종교가 전부일 수는 없었다. 델리에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인들이 떠난다는 말은 승진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힌두 국가' 인도에 계속 남아도 되는 것일까? 본인은 그렇다 해도 가족과 자녀는? 부모가 자식 염려하는 마음은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다. 자녀들의 장래에 어느 나라가 나을 것인가. 번민이 깊었을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가혹하리만치 촉박했다.
그들은 서류 더미도 분류해야 했다. 인도에 남을 자료와 파키스탄으로 옮길 자료가 나뉘어졌다. 구비품과 소모품도 나누어야 했다. 책상, 의자, 시계, 타자기, 금고까지 분할했다. 대개 인구 비율에 맞추어 8:2의 비율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다. 좋은 물건을 남기고 나쁜 물건을 보내려는 쪽과, 좋은 물건을 옮기려는 이들 간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다. 향후 양국 정부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한 상호 불신과 적대의 이미지는 이 분할 과정에서부터 싹을 틔운 것이다. 각자의 기억이란 저마다 편의적으로 왜곡되기 마련이다.
주요 대학과 공공 도서관의 장서들도 분할되었다. 대개 언어별로 쪼개졌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자료들은 파키스탄으로 보내졌다. 델리에 남아있던 무굴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대거 유실된 것이다. 지금도 델리 대학교와 국가 도서관을 비롯하여 인도의 주요 기관에는 무굴제국 자료들이 매우 빈약하다.
레드포트와 후마윤 무덤, 타지마할 같은 위대한 이슬람 건축물들은 인도에 남고, 문헌 자료들은 카라치와 이슬라바마드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 분단의 역설이라 하겠다. 그래서 각자가 무굴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는 인도나 파키스탄보다도 영국의 무굴제국 연구가 훨씬 빼어나다. 이란의 페르시아 문학과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조우하여 빚어냈던 인류 문명사의 한 정점을 연구한 문헌들도 대개 영어이다.
영국의 연구자들은 두 나라를 모두 드나들 수 있는 반면에, 양국의 연구자들은 줄곧 상호 방문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분단이 양국의 지적, 학문적 식민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후기 식민 상태를 지속시켰다. 탈식민주의 이론이 괜히 인도에서 나온 것도 아닐 것이다.

▲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도서관의 장서 분할. ⓒwikimedia.org
국가 분할의 핵심은 군대 분할이었다. 250만 대군을 무장 해제하고 인도국군으로 재편하는데 최소 5년, 최장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불과 70여 일 만에 군대도 반 토막으로 쪼개야 했다. 군대만큼은 서북 출신이 많았기에, 거의 양분되다시피 했다. 유라시아 전역에서 끈끈한 전우애를 쌓아왔던 군인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처사였다.
순식간에 무슬림과 힌두로 나뉘어져 파키스탄군과 인도군으로 서로를 겨누게 된 것이다. 총만 겨누는 것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세 차례의 전면전과 수차례의 국지전에서 이들은 적군이 되어 실제 전투를 수행했다. 그리고 군대의 분할은 장차 양 국가의 재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대분할 체제 속에서 비대하게 성장해간 양국의 군부는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화해와 화합에도 결사 반대하는 반동적 수구 집단으로 자라났다.
이처럼 분단 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분단이 영구적일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인도 총독부에 근무하는 영국인들부터 독립으로 가는 이행기의 임시 방편으로 간주했다. 인도 민중들 사이에서는 영국 음모론이 성했다. 인도와 아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인도를 내팽겨치는 것도 모자라, 도살장의 고기처럼 썰어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머지않아 파키스탄과 인도는 재결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국 인도의 산과 강과 바다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히말라야에서 인도양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스리랑카 사이를 '통일 인도'로 표상했다. 불행히도 이들은 근대 국가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국민 국가와 국가 간 체제는 제국처럼 느슨하고 유연한 정치체가 아니다. 영토와 국민을 꽁꽁 결박시키는 단단하고 딱딱한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다.
임박한 파국을 앞서 예상한 이는 역시나 애틀리 총리 본인이었다. "피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남겼다. 실제로 분단을 전후하여 영국의 경찰과 군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냉담하게 방치했다. 영국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생길 때에만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다. 인도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제국과 아직 들어서지 않는 두 근대 국가 사이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다. 북인도 일대는 점차 무정부상태로 빠져들었다. 펀자브 전역이 불타기 시작했다.
[유라시아 견문] 남아시아 펀자브 : 대분할 ②
강간하고 또 강간하고…1947 '지옥열차'
붉은 강
파키스탄의 라호르는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국경을 넘었다는 실감이 덜했다. 겨우 한 시간 남짓 걸렸을 뿐이다. 시차는 고작 30분이었다.
하지만 거리는 가깝되, 거리감은 적지 않았다. 일주일에 단지 두 번의 항공편만 있을 뿐이다. 연결망이 뜸한 것이다. 그런데도 방금 비행기를 타고 떠나왔던 델리와 몹시 흡사했다.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 외양부터 비슷했다. 시장 풍경도 어딘가 친숙했다. 거리에서 파는 음식부터 흘러나오는 노래까지 내가 석 달을 살았던 마유르 비하르의 뒷골목을 연상시켰다.
인도의 델리는 남인도의 첸나이와 서인도의 뭄바이보다 라호르와 훨씬 더 닮았다. 북인도 내륙부의 생활 세계를 공유했던 이웃 도시였기 때문이다. 본디 델리와 라호르는 펀자브를 대표하는 양대 도시였다. 적어도 500년간 펀자브 세계를 공유했다. 1858년에서 1911년까지 콜카타가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을 때도 델리는 펀자브 주에 속해 있었다. 델리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행정 구역이 분리된 것이다.
내년(2017년)이면 인도도 파키스탄도 건국 70주년이 된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델리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24시간 전, 파키스탄은 카라치에서 독립을 선포했다. 분리 독립, 분단 건국이었다. 그러나 델리에도 카라치에도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는 없었다. 그는 콜카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당시 벵골에서 자행되고 있던 힌두와 이슬람교도 간 폭력과 학살을 멈추라며 절절하게 호소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만 갈라졌던 것이 아니다. 벵골도 동/서로 찢어졌다. 서벵골은 인도가 되었고, 동벵골은 파키스탄이 되었다. 그래서 신생 국가 파키스탄의 모양새는 기형적인 것이었다.
인도 아대륙의 서북에는 서파키스탄이 들어섰고, 동북에는 동파키스탄(현재 방글라데시)이 세워졌다. 한 나라라고 했건만 서로 15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적성국이 된 인도를 통해서는 왕래도 할 수 없었다. 서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동파키스탄의 치타공까지 배편을 이용하면 꼬박 닷새가 걸렸다. 인공적이고 작위적인 근대 국가의 탄생이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독립을 맞이했다. 인도의 깃발 한복판에는 법륜(法輪)이 있다. 업보와 윤회의 상징을 국기에 새겨 넣은 것이다. 파키스탄의 국기는 녹색 바탕에 초승달이 그려졌다. 이슬람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는 여전히 힌두교들이 있었다. 인도에도 적지 않은 이슬람교도들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립이 곧 해방을 뜻하지 않았다. 숨죽인 채 낯선 국가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국경 마을'에서는 양국의 깃발이 번갈아 게양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두 번의 독립 행사에 모두 참여했다. 델리와 카라치에서는 폭죽이 터졌지만, 더 많은 곳에서는 약탈과 방화와 학살이 일어났다. 환호보다는 비명이 더 자주, 더 크게 들렸다. 특히 펀자브가 그랬다. 8월과 9월, 60일 사이에 60만 명이 죽었다.
펀자브(Punj-ab)도 우르두 어이다. 페르시아 어에 기원을 둔다. 'punj'가 다섯을, 'aab'가 물을 뜻한다. 다섯 개의 물, 다섯 줄기의 강을 일컫는다. 펀자브를 동서로 가르는 다섯 개의 강을 상징한다. 동쪽의 히말라야 눈이 녹아 서쪽의 타르 사막까지 흘러가는 중간에 펀자브가 자리했다. 풍부한 수량과 너른 벌판이 만나 풍족한 곡창 지대를 일구었다.
인구도 밀집되었다. 문화도 번성했다. 이슬람이 주류인 북인도 일반과도 다르고, 힌두교가 대세인 남인도와도 달랐다. 페르시아 문명과 힌두 문명이 가장 먼저 융합되는 곳이 펀자브였다. 나아가 독자적인 종교, 시크교도 번성했다. 넉넉한 살림살이는 마음가짐도 여유롭게 했다. 종교 갈등은 드물었다. 이슬람, 힌두, 시크는 그들만의 언어인 펀자브 어로 소통했다. 펀자브도 일종의 준(準) 국가였다.
과장이 아니다. 반 토막이 났을지언정 펀자브는 오늘날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큰 주이다. 주 인구만 9000만 명에 이른다. 2억 총인구의 절반이다. 9000만 명은 중동의 패자를 다투는 이집트, 이란, 터키보다 더 큰 숫자이다. 사실상 펀자브가 파키스탄의 군사와 경제, 정치와 문화를 주도한다. 그래서 '펀자브 패권주의'라는 말도 있다.
세계를 국가 단위로 쪼개어 보는 근대적 편견을 거둔다면,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펀자브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동펀자브, 즉 오늘의 인도령 펀자브에도 2800만 명이 살고 있다. 모두 1억2000만 명, 일본에 맞먹는 규모이다. 그 준 국가의 중심지였던 라호르는 대영제국 아래서도 '동방의 파리'라는 명성을 누렸다. 음식, 건축, 문학 등 여러 방면에서 윤택한 도시였다.
펀자브의 동서 분할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현장 실사는 없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인력은 부족했다. 결국, 지도 위에 줄을 치고 선을 그었다. 다섯 개의 강을 경계선으로 삼았다. 표본으로 삼은 것은 1941년의 인구 통계였다. 이슬람교도 비중이 70%인 서펀자브는 파키스탄으로, 이슬람교도 비율이 30~50%를 차지했던 동펀자브는 인도라고 했다.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가 크게 뒤틀렸다.
펀자브 세계의 고유성과 복합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힌두, 이슬람, 시크교의 공존과 공생이 파국을 가중했다. 특히 불안해진 것은 시크교도들이었다. 1947년 당시 600만 시크 가운데 400만이 펀자브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펀자브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쪼개진 펀자브에서 시크교가 어떤 처지로 몰릴지 장담할 수 없었다. 무굴제국 때도 대영제국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난국이 닥친 것이다.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 대영제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웠던 시크교 군인들은 격분했다.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했던 대가가 고향의 분할이란 말인가. 시크교의 창시자인 나낙 데브(Nanak Dev)의 탄생지(Nankana Sahib)가 서펀자브, 즉 파키스탄으로 귀속된다는 소식에 동펀자브의 시크교도들은 더더욱 격노했다. 성지 순례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차라리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펀자브국'을 만들자고 했다. '시키스탄(Sikhistan)'으로 분리 독립하자는 이도 있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시작했다. 마을마다 자경단을 만들었다. 시크교도들은 인도 총독부가 가장 군사적인 민족으로 분류했던 이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이탈리아를 무찌르고,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일본을 격퇴했던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었다. 어제의 역전의 용사들이 펀자브 내전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펀자브에서 자행된 힌두, 이슬람교도, 시크 간 삼파전은 유난히 치열하고 격렬했다. 우연하고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종 학살에 가까웠다. 유럽의 홀로코스트와 아시아의 킬링필드가 동시에 펼쳐진 것이다. 흥건한 핏물이 다섯 개의 강을 붉게 적셨다.

죽음의 기차
분단 건국으로 사태가 종결된 것도 아니었다. 근대 국가는 국민을 산출하고, 국민은 비국민을 양산하며, 난민을 국가 밖으로 배출한다. 건국 이후 폭력은 이제 '내부의 적'으로 향했다. 특히 출신 성분이 의심스러운 군인과 경찰들은 곧바로 직위를 박탈했다. 일부는 동료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양민 학살도 이어졌다. 인도인은 잠재적인 파키스탄인, 이슬람교도를 향해 테러를 가했다. 파키스탄인은 인도인에 가까운 이들, 힌두와 시크를 살해했다.
결국, 10월 14일, 양국 정부는 동/서 펀자브의 '소수자'들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건국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은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 피난민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각국을 순화시켜가는 과정, 근대적인 국민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이 많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 마을이었던 곳이 돌아갈 수 없는 타국이 되었다.
펀자브에서만 약 1000만 명이 이동했다. 동펀자브에서 서펀자브로 이주한 인구는 435만, 서펀자브에서 동펀자브로 이주한 인구는 429만을 헤아린다. 인도/파키스탄 전체로는 1500만 명이 이동했다. 20세기를 통틀어 최단 기간 내 최다 인구의 교환이었을 것이다. 1951년 통계로 파키스탄 인구의 10%가 난민이었고, 델리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었다. 인도는 한때 수도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펀자브와 가까운 델리가 안보상 취약한 지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결국 이슬라마바드라는 별도의 행정 수도를 지었다.
방향은 달라도 피난 경로는 겹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나 기차가 복병이었다. 기차역 곳곳에서 습격과 폭동이 일어났다. 떠나는 자들은 곧 적을 의미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기차역에서 보복을 가했다. 그들에게는 남은 이들이 적이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여성들을 강간했다.
보복과 복수가 반복되면서 남성들이 보여준 극한의 야만성은 종교를 가리지 않았다. 강간으로 내 편의 모욕을 씻고, 적에게는 치욕을 남기려 했다. 이 무한의 악순환으로 기차 또한 피로 물들어갔다. 기차는 떠났지만, 철로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기차마다 산 자만큼이나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가 많았다. 시체를 싣고 도착하는 죽음의 기차 행렬은 1947년 대분할의 상징적 이미지로 남아있다. 1992년 구자라트에서 일어난 힌두의 이슬람교도 학살 또한 기차를 목표물로 삼은 것이었다.
'압축적 근대화'
펀자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을 때, 영국인은 뭄바이 항에 집결했다. 길게는 동인도회사 이래 200년, 짧게는 대영제국 100년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귀환 길에 올랐다.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국은 낯선 땅이었다. 인도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영제국의 해체를 애감해했다. 힌두교와 이슬람 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아대륙을 애통해했다.
영국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명화가 덜 된 것이라고 여겼다. 런던에서도 죽지 않은 노병, 윈스턴 처칠이 몇 마디 보태었다. 인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학살이 절대 놀랍지 않다고 했다. 대살육이 더 이어져 아대륙의 인구가 격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격감까지는 아니었다. 원체 인구가 많았다. 자잘한 유럽 국가들과는 애초 규모가 달랐다.
순교자의 공도 있었다.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간디가 암살된다. 마하트마 간디가 파키스탄에 유화적이라며 앙심을 품은 힌두 근본주의자의 소행이었다. 그의 죽음 앞에서만은 파키스탄도 인도도 하나가 되어 애도를 표했다. 상호 대학살에도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다. 마하트마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힘사(비폭력)가 잠시나마 실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인구 분포는 이미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동펀자브에서 이슬람교도는 격감했다. 서펀자브에서 힌두와 시크는 사라지다시피 했다. 오늘날 라호르에서 힌두 사원을 찾아보기는 좀처럼 힘들다. 일부로 골목 구석구석을 다녀보아도 눈에 들지 않았다. 순수한 이슬람 도시가 된 것이다. 시크와 이슬람교도와 힌두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우물을 사용하며 장기 지속했던 펀자브 세계가 말끔히 소거된 것이다. 오래된 펀자브가 사라지고, 새로운 펀자브가 들어섰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근대화'되었다.
종교에 기반을 둔 국가의 분할은 인도 아대륙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다. 무굴제국 이래 반천 년간 지속되어왔던 제국사로부터 급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애초 남아시아에서 종교 전쟁부터가 이례적인 것이었다. 인도 아대륙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힌두교와 불교, 자니교 등의 특성상 극단적인 갈등은 드물었다.
기독교-이슬람의 천년 전쟁과 천주교-개신교, 수니파-시아파 간 신/구 전쟁은 유라시아의 서쪽 아브라함 전통이 깊은 곳에나 해당하는 현상이었다. 즉, 남아시아에서 종교적 귀속감에 따라 정치 공동체를 결집하여 적대하는 것은 20세기의 소산, 전형적인 '서구화'의 산물이었다. 왕년의 신앙 공동체를 근대의 신념 공동체로 전변시켜갔던 유럽식 '민족주의'가 이식된 것이다. 신교 국가와 구교 국가의 영토를 명확히 구획했던 국가 간 체제의 도입과 함께 남아시아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와 힌두 근본주의가 길항하는 대분할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문명화가 덜 되어서가 아니라, '문명화'에 따른 현상이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 근대화' 또한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총독부는 인구 통계를 위하여 종교와 민족을 분류했다. 분류된 종파와 종족은 분리 통치를 위해 활용되었다. 선거에서도 힌두와 이슬람교도를 분류하여 대표자를 따로 선출토록 했다. 마을 구석구석까지 근대적인 인구 정치가 침투하면서 주민과 이웃 간 타자화를 촉발시킨 것이다. 당장은 국민회의와 무슬림연맹의 분화를 야기했고, 결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을 초래했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국어는 펀자브 어가 아니라 우르두 어이다. 인도의 펀자브에서도 힌디 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펀자브가 두 개의 국민 국가로 쪼개지면서 지역성은 약화되고 국가성은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펀자브 어는 시크교도만의 언어인 마냥 쪼그라들었다. 우르두 어는 무슬림 언어, 힌디는 힌두의 언어, 펀자브 어는 시크의 언어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또한 근대적인 언문일치, 언어 민족주의로 갈라진 것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 하나의 언어 공동체로 작동하던 펀자브 세계의 독자성, 고유성, 토착성은 시나브로 사라져 갔다.
펀자브의 복합 사회를 낭만화하고 싶지는 않다. 작년(2015년)에 방문했던 중국 윈난 성의 이슬람 마을에 견주자면 친밀도가 훨씬 떨어지는 편이었다. '食口(식구)'가 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삼가고, 힌두는 소고기를 피한다. 반면 시크교도는 육식을 꺼리지 않는다. 한집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나누어 먹는 원초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도 오순도순, 알콩달콩은 아니었을지언정 아웅다웅, 티격태격 살지도 않았다. 끝내 '펀자브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용해되지는 않았지만,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펀자브성'만은 이루었다. 이 펀자브성의 상실이야말로 대영제국이 남아시아에 남기고 간 최대의, 최장의, 최악의 유산이다.

▲ 파키스탄 라호르의 모스크. ⓒ이병한

▲ 파키스탄 라호르의 아침. ⓒ이병한

▲ 파키스탄 라호르의 야시장. ⓒ이병한
트라우마
양국이 적성국이라는 사실은 비자 인터뷰 때부터 느낄 수 있었다. 내 인도 비자는 연구원에게 발급되는 6개월짜리였다. 그 기간 인도의 안과 밖을 오갈 수 있는 복수 여권을 신청했다. 인도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나라를 다닐 계획이냐고 물었다. 인도 주변국 즉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등이라고 답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주어 담을 수는 없었다. 파키스탄에 간다고? 그는 재차 물었고, 나는 움츠러들었다. 가고는 싶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며 어물쩍거렸다. 그는 다시금 확인했다. 파키스탄에 갈 계획이 있느냐? 이번에는 슬쩍 역정이 났다. 문제가 된다면 가지 않겠다, 인도 비자가 만료되고 가면 그만이라며 으쓱 어이없다는 어깨 짓을 보였다.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철칙을 잠시 잊은 것이다. 당장 부작용이 일었다. 사무실 밖에 나가서 기다리란다. 그렇게 다섯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야 다시 나를 불렀다. 본국에 확인해보니 파키스탄 방문도 가능하단다. 미덥지 않았다. 일부러 몽니를 부린 것 같았다. 괘씸했지만, 고맙다고 했다.
라호르 공항에서도 입국이 간단치는 않았다. 인도에서 발급한 6개월 복수 비자를 보더니, 이유를 묻는다. 인도에서 무슨 일을 하며, 파키스탄에는 왜 온 것이냐며 꼬치꼬치 캐묻는다. 언론인이라고 하면 일이 더 꼬일 것 같았다. (다음 주에 쓸) 카슈미르 방문에서 이미 곤욕을 치른 후였다.
역사학자라고 해도 여의치 않을 듯싶었다. 궁여지책, 여행 작가라고 했다. "Journey to the Eurasia"를 집필 중이라고 했다. 라호르와 카라치, 이슬라마바드의 숙소까지 확인한 후에야 입국 도장을 찍어 주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상호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우에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된다고 한다.
새천년을 전후로 분할 체제가 흔들리는 듯 보였다. 1999년 2월, 당시 인도 총리였던 바지파이는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라호르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선보였다. 당시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를 비롯해 수천 명의 펀자브인들이 환대하고 환영했다. 2004년 인도-파키스탄 정상 회담은 특히 펀자브인들에게 인상적인 기억을 남겼다.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은 1932년에 태어난 시크교도였다. 서펀자브가 고향이다. 대분할 당시 인도로 떠난 피난민 출신이었다. 반면 당시 파키스탄을 통치하던 무샤라프 장군은 1943년 델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싱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피난민이었다. 뉴델리에서 정상 회담을 마친 두 펀자브인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재회하기로 했으나,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
펀자브 주 차원에서의 노력도 각별하다. 2012년 11월 인도령 펀자브의 주지사가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대동하여 라호르를 방문했다. 펀자브 동서 간 무역을 증진시키자며 비관세 상품을 확대하고 도시 간 연결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펀자브 국경 지대 마을 사람이 동펀자브의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라호르-델리 간 고속열차 'Samjhauta Express'가 주목된다. 지금은 직통이 아니다. 국경 마을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이곳을 직선으로 잇는 고속열차를 짓자는 것이다. 내년(2017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2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과 일본의 수주 경합이 치열하다고 한다.
분단 100년이 되는 2047년에는 '펀자브 공동 시장'을 출범시키자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적 재통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생활 세계의 재통합은 일정한 궤도에 오른 모양새이다. 과연 두 개의 국가, 세 개의 종교 집단으로 분할되었던 '펀자브 세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작정이다.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후유증이 원체 심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델리에서 요가 인맥으로 초대받은 한국분의 남편이 펀자브 출신이었다. 그의 할머니가 피난민이었다.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한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 산 채로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왔다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에도 모성은 질겼다. 두 아이를 데리고 델리로 피신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라호르에서는 집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언제 이슬람교도들이 망치와 낫을 들고 와 강간하고 살해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밤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아이들을 품에서 재우고 할머니는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한다.
겨우 기차를 타고 나서도 괴한들이 침입하며 식칼을 들이밀고 힌두 국가를 원하느냐, 이슬람교도 국가를 원하느냐 심문받기도 했다. '호신용'으로 준비해둔 코란을 보여주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그 당시에 정신과 상담 같은 것은 드물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분할 당시의 상처를 안고 여생을 났다는 말이 된다. 그 집합적 트라우마는 지금도 간헐적으로, 그러나 폭발적으로 분출한다. 지난 3월 네루 대학교 사태 또한 1947년의 대분할과 결코 무관치 않은 사건이었다. 내상이 무척 깊다.
실제로 분단 건국이 무섭게 인도와 파키스탄은 곧장 전쟁에 돌입했다. 냉전기에만 세 차례 전면전을 벌였고, 탈냉전기에도 간간이 국지전이 일어났다. 화근은 단연 카슈미르였다.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장소이다. '히말라야의 눈물' 카슈미르로 간다.
[유라시아 견문] 카슈미르 : 대분할 ③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옥, 카슈미르
비대칭적 분할 체제
펀자브와 이웃한 카슈미르도 쪼개졌다.
분할의 양상은 한층 복잡한 것이었다. 기층과 상층이 크게 어긋났다. 종교와 국가를 균질화하는 '두 민족'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다. 무슬림이 다수임에도 인도에 편입된 영토가 훨씬 넓었다. 카슈미르의 3분의 2를 인도가 차지했다. 파키스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미수복된 '이슬람의 땅'을 되찾고자 했다. '자유 카슈미르'로 해방하려고 했다. 인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카슈미르는 초대 총리 네루의 고향이기도 했다. 세속주의 인도를 과시할 수 있는 최적의 보루였다.
결국, 분단 건국 4달 만에 전쟁이 일어난다. 유엔(UN)의 중재 끝에야 휴전에 이를 수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선(Line of Control)은 남한/북조선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길다. 장장 750킬로미터에 달한다. 서로 핵무장을 한 강대국 사이에 그어진 거대한 분열선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자, 가장 오래된 분쟁 지역이다. 국지전은 수시로 일어나고, 전면전도 종종 발생한다. 가장 최근으로는 1999년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인도령 카슈미르에만 70만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 파키스탄 역시 100만 대군의 3분의 2를 자국령 카슈미르에 주둔시켜 두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전개된 지난 15년 동안도 파키스탄의 주력군은 항시 인도와 접경한 카슈미르에 집결되어 있었다. 군사 밀집도에서 단연 세계 으뜸이다.
그래서 여태 내가 다녀본 곳 가운데 가장 삼엄한 장소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에 자리를 잡은 듯한 인도령 카슈미르 주도 스리나가르의 카슈미르 대학 캠퍼스에도 군인들이 즐비했다. 스리나가르 곳곳에 경찰과 군인이 포진되어 있었고, 외국인임에도 불심검문이 다반사였다.
그 살풍경을 카메라에 담다가 경찰에게 딱 걸렸다. 카메라는 물론 핸드폰까지 압수당했다. 사진을 모두 지운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도 아니었다. 언론사 명함을 확인한 후로는 내 숙소까지 사람을 붙였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취재가 불가하단다. 기자가 아니라 학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매일 저녁 숙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에게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보여주어야 했다. 일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삭제되었다. 몹시 불쾌했지만, 장총과 권총 앞에서 불만을 내놓고 표출하기는 힘들었다. 군사 정부 시절, 식민지 시절이 이랬을까 싶었다.
카슈미르는 인도-파키스탄의 비대칭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분할 당시부터 인도의 국력이 압도적이었다. 영토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등했다. 그 비대칭적 분할 체제는 파키스탄의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며 '대국 외교'를 추구했던 인도와는 달리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동맹 정책을 추진했다.
패권국 미국과 결탁했다. 특히 신중국 건국(1949년) 이후 혼란에 빠진 미국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었다. 세계 지도를 가리켜 파키스탄의 위치를 강조했다. 소련과 중국을 접한 곳에 파키스탄이 자리했다. 유라시아의 사회주의화를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파키스탄을 동맹국으로 삼으면 소련, 중국, 인도, 유라시아의 3대국을 모두 견제할 수 있었다. 당시 파키스탄에는 대영제국의 후예답게 군사적인 경험이 충분하고, 이슬람 국가로서 사상 무장(=반공주의)도 투철한 군대가 30만이었다.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이 1954년이다.
1950년대 파키스탄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두 개의 안보 기구에 동시에 참여한 유일한 국가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SEATO에 가입하고, 서아시아에서는 CENTO에 가입했다. 전자에서는 필리핀, 후자에서는 이란, 터키와 보조를 맞추었다. 대영제국 아래서 인도가 맡았던 역할, 즉 중동과 동남아에서의 안보 지킴이를 고스란히 계승한 것이다.
영국을 대신하여 이제는 미국이 군사 훈련을 시켰다. 펜타곤의 군사 학교에서 장교를 양성했고, 미국의 군사 고문단이 파키스탄에 파견되었다. 서파키스탄의 군사 기지(카라치와 라호르)에서는 소련의 정보를 수집했고, 동파키스탄의 군사 기지(치타공과 다카)에서는 중국의 정보를 수집했다.
양국의 통신을 감청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 군사적 동향을 파악했다. 그 대가로 최신의 전투기와 탱크, 잠수함 등을 파키스탄에 보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세력 균형도 흔들렸다. 군사력만큼은 파키스탄도 못지않았다. 거듭하여 카슈미르 수복을 시도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더 중요하게는 파키스탄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다. 파키스탄 건국을 주도했던 무슬림연맹은 곧 힘이 빠졌다. 군부가 과대 성장했다. 파키스탄 독립 선포 당시 호기롭게 표방했던 '이슬람 민주주의'는 슬그머니 기각되었다. 정당이나 교단이 아니라 군대가 나라를 이끌었다. 군사 독재 국가가 된 것이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양국의 갈림길 자체가 비대칭적 분할 체제의 소산이다. 이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아 군부가 주도하는 반공주의적 근대화 이론을 정립한 이가 새뮤얼 헌팅턴이다. 냉전기 '파키스탄 모델'이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로 널리 퍼졌다.
점령
1987년 카슈미르도 '민주화'되었다. 선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줄곧 델리의 중앙 정치를 대변하는 정당들만 있었을 뿐이다. 1951년 첫 총선 이래 '인도 정당'들이 카슈미르를 지배했다.
1987년 처음으로 토착적인 지방 정당 무슬림연합전선(Muslim United Front)이 선거에 참여했다. 카슈미르 일대는 녹색으로 물들었다. 거리와 시장, 지붕마다 무슬림연합전선의 녹색기가 휘날렸다. 1947년과는 전혀 다른 해방의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응당 압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무슬림연합전선 후보가 출마한 44개 지역 가운데 고작 4곳에서만 당선되었다.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이로써 1947년 이래 40년간 카슈미르가 처해 있던 위상이 확실해졌다. 세계 최대의 탈식민 국가의 내부 식민지였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안의 독재 구역이었다. 인도군은 국군보다는 점령군이었다. 'Democracy without freedom is Demon-Crazy'가 카슈미르의 구호가 되었다. 인도의 독립운동 '인도를 떠나라(Quit India)'를 비틀어 '카슈미를 떠나라(Quit Kashmir)'를 외치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무장 투쟁도 본격화되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짱돌을 던지며 저항하는 수준에 그쳤다. 알카에다보다는 팔레스타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일부 급진적 청년은 이웃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잠입했다. 군사 훈련을 받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무자히딘이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던 소련을 축출한 탈레반처럼, 인도로부터 카슈미르를 해방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수에 그쳤다. 다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는 무관했다. 자유와 자치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인도는 총력전으로 응징했다. 1989년 한 해만 8만 명이 학살되었다. 700만 카슈미르 인구의 1%가 죽은 것이다. 같은 해 천안문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폭압이었다. 실제로 북쪽으로 이웃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견주어도 억압의 강도가 훨씬 높고 가혹하다. 국가폭력도 만연하다. 무슬림에 대한 고문과 강간이 숱하게 자행된다. 카슈가르와 카슈미르는 천양지차다.
그런데도 주목받지 않는다. 프레임 탓이다. '민주주의 인도'와 '이슬람 파키스탄'의 구도로 접근한다. '세속주의 인도'와 '근본주의 파키스탄'으로 이해한다. 카슈미르에 내재하지 못하고 대분할 체제의 균열을 투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방의 주류 언론에서도 소홀하고,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관심도 덜 미친다.
'민주화'의 대서사에 부합하는 중앙아시아의 색깔 혁명과 중동의 '아랍의 봄'은 대서특필하지만, 2010년 카슈미르의 대규모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외면당한다. 현실주의 정치, 이른바 '대전략'이 작동하는 면도 있다. 인도를 '브릭스'에서 떼어내어 유라시아의 대통합을 저지하려 든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갈라 쳐서 일본과 연결시키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흡사 오키나와의 처지가 연상되기도 했다. 대국 간 냉혹한 '그레이트 게임'에 희생되고 있다.
인도 역시 대분할 체제의 뒤틀린 시각으로 접근한다. 거듭 외부의 사주, 즉 파키스탄의 '내정간섭'으로 곡해한다. 인도의 '자유주의적' 시민 사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카슈미르에 고도의 자치가 보장된다면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고, 인도의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한다. 파키스탄과 합작하여 분리 독립하거나 파키스탄으로 병합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처럼 글로벌 테러의 온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카슈미르의 눈물과 분노가 인도의 점령군적 행태로부터 촉발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커녕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슬람 국가들과 싸워 승리한 경험을 전수받고, 이스라엘산 무기를 구입하여 카슈미르 일대에 실전 배치해 두었다. 자가당착, 적반하장이다.
지난 3월과 4월, 네루대학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TV 채널에서 카슈미르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지켜볼 수 있었다. 볼수록 답답하고 갑갑했다.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세속주의자 모두 냉담하다. 인도인민당과 국민회의를 막론하고, 여야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영제국의 토사물임에 분명한 '인식의 인종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유럽에서 전수받은 이슬람 혐오를 복제한다. 카슈미르 인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한다. 중무장한 인도 군대는 보이지 않고, 저항하는 카슈미르 인만 클로즈업될 뿐이다.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이다.
커다란 도착이 아닐 수 없다. 인도는 유럽처럼 이슬람과 천 년 전쟁을 겪었던 지역이 아니다. 신앙으로 사생결단하는 종교 전쟁이 부재했던 곳이다. 오히려 무굴제국의 영향 아래 페르시아-힌두 문명이 융합되는 인류사의 대장관을 연출했던 장소이다. 자신의 빛나는 역사와 격절된 채 퇴행적인 분할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고/금 간의 분단이 역력하다. 국가 간 체제가 나라만 쪼개었을 뿐 아니라, 문명화 과정 또한 굴절시켰다. '역사 없는 근대'가 판을 친다. '근대화'의 병폐이고, '교조적 민주주의'의 적폐이다.

ⓒ이병한

ⓒ이병한

ⓒ이병한

ⓒ이병한
낙원
카슈미르는 한때 지상 낙원이라 불렸다. 풍광이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봄과 여름이 절정이다. 히말라야의 설산을 배경으로 붉은 튤립과 노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눈이 고인 호수는 고요하고, 눈이 녹아 흐르는 폭포는 장엄하다.
유독 이곳을 사랑했던 이가 악바르 대제의 아들 자한기르였다. 그는 야심찬 정치가보다는 섬세한 예술가 쪽이었다. 무굴제국의 보위는 아내에게 맡기고, 펀자브 평원에서 벗어나 고산의 절경을 향유하는 삶을 즐겼다. 곳곳에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이슬람식 정원과 별장을 만들고, 아편을 피우고 와인을 마시며 지상낙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를 페르시아어로 지었다.
야심보다는 시심을 자극하기로는 자한기르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카슈미르 출신의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델리와 라호르 등 펀자브의 대도시로 이주하여 전성기를 구가했다. 무굴제국기는 카슈미르의 호시절이고 봄날이었다.
뜻하지 않게 나도 그 절경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주요 분쟁지와 경계지 방문을 거부당한 탓이다. 델리에서 미리 통보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나흘이나 일정이 비었다. 이것도 알라의 뜻이려니, 산악자전거를 빌렸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고속도로를 따라 하루에 100킬로미터씩 달리고 또 달렸다. 차도 거의 오가지 않았다. 히말라야를 통째로 전세 낸 것 같았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무지개도 보았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물론 중국의 카슈가르까지도 닿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실제로 국경을 지운 유라시아 전도를 펴놓고 카슈미르의 위치를 짚으면 '이슬람 세계'의 한가운데 자리한다. 카슈미르의 동서남북으로 북인도와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서중국이 하나의 권역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가별 지도가 '문명의 지도'를 가리고 지우고 있다. 국가 간 체제가 얼마나 작위적인 질서인가 다시금 확인한다. 어떻게 세계를 좀더 '자연스럽게' 디자인할 것인가 궁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부드러운 국경(soft border)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모양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간의 경제 합작을 추진한다. 카슈미르를 꼭짓점으로 삼아 세 대국의 연결망을 이어보자는 것이다. 삼국이 공동으로 카슈미르의 안보를 책임지는 연합군 창설 논의도 있다. 자연스레 군대 축소와 군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 차례 전쟁을 촉발했던 히말라야의 화약고를 평화 지대이자 '문명 특구'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주권의 배타적 독점이 아니라 주권을 공유하고 분유하는 창발적 실험지, '정치적 낙원'을 도모한다.
물론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근대적 국가 이성이 이슬람적 형제애를 잠식한 지 100년이다.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 또한 70년을 헤아린다. 부드러운 국경 정책 또한 하루아침에 완수될 성질이 아닐 것이다. 이곳서도 2047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이 절실하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국경 정책의 당사자가 인도와 파키스탄만이 아님이 눈에 든다. 중국도 있는 것이다. 과연 중국령 카슈미르도 있던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방문했던 카슈가르 바로 아래 동네였다. 벵골만과 아대륙을 길고 크게 우회하여 이웃 마을에 당도한 것이다. 저 히말라야 너머 동쪽이 카슈가르였다. 즉, 카슈미르는 양분된 것이 아니라 삼분되어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만이 다투었던 것이 아니다. 인도와 중국도 경합했다. 전쟁까지 일어났다. 히말라야를 사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충돌했던 것이다.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와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여기 카슈미르에서 착종되고 있었다. 1962년 중-인 전쟁으로 돌아간다.

ⓒ이병한

ⓒ이병한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대분할 ④ : 히말라야 전쟁
1962년, 중국이 인도를 먹다 뱉다
갤브레이스의 '인도견문록'
이곳저곳 다니며 남들이 쓴 여행기도 종종 읽는다. 잠들기 전 침실용 독서로 딱이다. 인도만큼 여행기가 많은 나라도 없지 싶다. 방랑벽을 자극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멀리로는 러디어드 키플링부터 꼽을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원형과 전형을 확인시켜준다.
키플링을 전복시킨 영국인도 있었다. 조지 오웰이다. 글로써 모국 대영제국의 허위를 서늘하게 까발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리감이 없지 않았다. 영국과 인도, 유럽과 아시아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 오카쿠라 덴신의 인도 여행기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는 불교를 매개로 인도와 일본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20세기 초 일본발 아시아주의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헌이다. 나로서는 <왕오천축국전>이 유난히 각별했다. 육로로 인도에 닿아 해로로 귀환하는 여정부터 돋보인다. 1000년 전 불교 황금기의 동유라시아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인도-한국이 합작하여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스펙터클한 서사이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나온 책들은 대개 실망스러운 쪽이었다. 옛 글을 애호하는 취향 탓만은 아닐 것이다.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남아시아 현대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대분할 체제로 열전과 내전이 거듭되었음에도, 평화와 명상이라는 엉뚱한 이미지만 답습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잘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아름다운 사진과 감상적인 문장으로 대단치도 않은 자의식을 어여쁘게 읊조리는 것이다. 뜨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지와 미문으로 거듭 허상을 수립한다. 정작 당대 인도는 철저하게 소외된다. 결국 진상에도 이르지 못한다. 공부가 수반되지 않는 여행의 병폐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여행기 중에 단연 갑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견문이었다. <풍요한 사회>와 <불확실성의 시대> 등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경제학자이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매일매일 미국과 세계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재기 넘치는 문장으로 기록해 두었다. 인도에 관련된 일기만 따로 떼어내어 편집한 책도 발간되어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카슈미르를 만끽하던 나흘간 탐독했던 책이다.
갤브레이스가 처음 인도를 여행한 해가 1956년이다. 크게 반했던 모양이다. 당초 계획보다 오래 인도를 주유한다. 델리, 뭄바이, 바라나시, 다즐링, 카슈미르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취미도 고상했다. 무굴제국의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답게 콜카타에서는 인도 경제도 연구했다. 네루를 만나서는 경제 정책을 토론한 적도 있다.
재방문한 것은 1959년이다. 그리고 큰 뜻을 품는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자 '민주주의 국가'였다. 세계 최대 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다른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겼다. 그 규모와 위치를 보건대 인도의 민주주의 실험의 성패야말로 아시아의 향로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도양을 아울러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정치사적 위상을 부여했다. '인도 모델'을 수립하여 제3세계로 확산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백면서생이 아니었다. 사대부에 가까웠다. 時勢(시세)를 살펴, 時務(시무)를 권했다. 그의 절친이 바로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였다. 1950년대 말, 케네디는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다. 갤브레이스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케네디의 연설문 작성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인도를 주목하자고 친구에게 권유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인도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네루와 세계관이 전혀 달랐다. 냉전을 발동시킨 미국과는 달리 네루는 1945년 이후의 세계를 달리 보고 있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끝나고 새 문명이 시작되는 시대라고 여겼다. 20세기 후반의 주인공 또한 미국이나 소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도와 중국이 주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비동맹 노선을 주창한 것이다. 탓에 미국서는 사회주의에 경사된 인물로 꼬아보았다. 냉전이라는 선/악의 대결에서 중립을 추구하는 비동맹 또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파키스탄에 견주어 인도에 대한 반감이 몹시 심했던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제출한 이가 케네디였다. 갤브레이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시아 정책의 틀을 다시 짜려 했다. '민주주의 인도'와 '공산주의 중국'의 경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다. 인도는 (미국처럼) 영국에서 독립한 탈식민 국가로 추켜세우고, 중국은 소련의 지휘를 받는 종속 국가로 깎아내렸다.
소련에 맞서 서유럽을 부흥시켰던 마셜 플랜처럼, 중국에 맞서 인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유 세계'가 인도와 협조하여 붉은 중국을 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의 입김이 커질 수 있었다. 1960년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인도가 냉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 인도 뉴델리의 미국 대사관. ⓒ이병한
1961년 갤브레이스는 직접 무대 위로 뛰어 오른다.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 인도 대사로 취임한다. 몸소 자청한 것이었다. 인도를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 중국을 역전시켜 아시아의 정세를 반전시킨다는 꿈을 꾸었다. 그의 부임과 함께 인도의 미국 대사관도 재개장했다. 이 또한 야심찬 건축물이었다. 훗날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를 짓기도 한 당대의 건축가 에드워드 스톤이 디자인했다. 미국-인도의 새 출발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건물이었다.
단, 케네디는 떠나는 친구에게 조건을 달았다. 인도에서 일하더라도 전 세계의 동향에 대한 조언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부탁했다. 실제로 갤브레이스의 회고록에 따르면 대사로서의 업무는 하루에 2시간이면 족했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은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은 물론, 아시아 여성에 대한 품평까지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케네디에게 전했다. 국무부를 비롯해 워싱턴의 관료 기구에 불신과 반감이 심했던 갤브레이스는 항상 백악관의 대통령 직무실로 직접 전갈을 보냈다. 공식 라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 최측근이었다.
그러나 인도 대사 취임은 처음부터 불길한 것이었다. 뉴델리로 부임하기 직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남아시아 브리핑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1950년부터 파키스탄과 네팔을 통하여 티베트 전복 공작을 펼치고 있던 것이다. 1959년 라싸 봉기에도 CIA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는 중국과의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라며 아연실색했다.
철두철미 자유주의자였던 갤브레이스는 정정당당한 체제 경쟁을 원했다.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은 불미스러운 짓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취임 1년 만에 중인 전쟁이 발발한다. 2시간 업무는커녕 2시간도 잘 수 없었던 시기이다. 일기의 호흡마저 가팔라졌다. 각성제를 먹어가며 밤을 새워 상황을 관리했다. 1962년 가을이다.

▲ 네루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wikimedia.org
카리브와 히말라야
그럼에도 중인 전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62년은 단연 쿠바 미사일 위기로 기억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카리브 해로 관심이 치우쳐 있다. 냉전을 미-소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가 이미 산적하다. 영어와 러시아어로 출간된 단행본만 기십에 이른다.
소련이 극비리에 핵무기를 쿠바에 배치하여 미국의 동남부, 나아가 워싱턴을 겨냥했다. 자칫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기'였을 따름이다. 정작 열전이 터진 곳은 히말라야였다. 쿠바에서 어제의 G2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을 때, 히말라야에서는 내일의 G2가 충돌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인류의 3분의 1이었다.
단, 미국과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었다. 아니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티베트가 자리한다. CIA는 사이판과 콜로라도에서 티베트 청년을 훈련시켰다. CIA의 보호 아래 미국에 머물고 있던 달라이 라마의 큰 형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침투의 근거지는 파키스탄의 미군 기지였다.
치타공(동파키스탄, 현 방글라데시)에서 CIA의 비행기를 타고 잠입하며 인민해방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쳤다. 1959년이 일대 분수령이다. 대봉기와 대진압이 충돌했다. 달라이 라마가 망명한 곳은 인도의 다람살라였다. 당시 네루는 티베트 전복 공작에 미국-파키스탄 동맹이 가동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티베트 봉기가 인도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반둥 회의 4년 만에 아시아의 양대 대국이 분열하고 있던 것이다. 양국의 틈을 벌리려던 미국의 기획이 성공한 셈이다.
중국은 두 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격했다. 서쪽으로는 카슈미르로, 동쪽으로는 벵골 만으로 남하했다. 카슈미르에서는 악사이친(Aksai Chin)과 라다크까지 진출했다. 더욱 위태한 것은 동부 전선이었다. 인도의 주력군이 서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한 펀자브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동북부는 전력이 모자랐다. 인민해방군은 부탄과 시킴을 따라 미얀마 접경까지 일사천리로 남진했다. 벵골과 아삼이 코앞이었다.
당시 네루와 케네디 사이에 오갔던 전갈이 2010년에 공개되었다. 냉전사 연구의 중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온라인 자료실에서 열람해 볼 수도 있다. 네루는 기겁, 기함하고 있었다. 벵골과 아삼은 물론 동인도 전체를 중국이 점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했다. 과장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당시 북인도의 무슬림 사이에는 중국이 아삼과 벵골을 동파키스탄에 넘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다. 북인도 전체가 파키스탄으로 재통일되어, 아대륙이 남북 분단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기시감이 일지 않을 수 없다. 20여 년 전, 대일본제국이 동북인도로 진출하여 임팔 전투가 펼쳐졌다. 당시 네루는 수감 중이었다.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국가 붕괴의 공포를 경험한 것이다. 당시 간디가 비폭력의 무기력을 확인했듯이, 이번에는 네루가 비동맹의 무력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여전히 뜻이 아니라 힘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다.
인도로 남하한 인민해방군만 17만이었고, 티베트에 대기하고 있는 병력만 30만이었다. 유일한 타개책은 공중 폭격으로 티베트와 북인도 사이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00여기의 전투기를 확보한 인도에 견주어 중국은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중전에서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의지할 곳은 군사 최강국 미국이었다. 미 공군에 지원을 요청했다. 말년에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던 외교 노선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벵골 만 건너 태국에서, 아라비아 해 건너 이란과 터키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었다. 여차하면 적대국인 동/서 파키스탄의 미군 기지에 의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인 전쟁 발발 이틀 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다. 케네디는 히말라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갤브레이스에게 전담시키다시피 했다. 갤브레이스가 패닉 상태에 빠진 네루의 전시 참모 노릇을 한 것이다. '인도 모델'의 수립은커녕 인도의 보위부터 챙겨야 했다. 다시금 CIA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갈았다.

▲ 1962년 중인 전쟁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wikimedia.org
한국 전쟁의 그늘
11월 21일. 네루와 갤브레이스의 노심초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평화가 찾아들었다. 자정을 기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것이다. 24시간 내에 인도에 진출한 인민해방군의 철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1일까지 국경선 20킬로미터 후방으로 물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군사적으로 점령했던 영토에서 자진 철수하여 기왕의 국경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신 인도군 또한 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쟁 발발 직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양국 간 국경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영제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저우언라이와 네루가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산물인 국경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지되었을 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 중국의 일방적인 철수로 중인 전쟁은 순식간에 종식되었다.
마오는 왜 돌연 종전을 선택했는가? 중국 쪽 연구를 참조해볼 만하다. 일단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인도와 미국에 본때를 보여주었다. 케네디-갤브레이스가 도모하던 '인도 모델'에 초장부터 재를 뿌린 것이다. 중국이 인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특히 제3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 독자의 사회주의가 서방의 모조품에 불과한 인도의 민주주의보다 월등하다는 것이다. 하여 제3세계는 중국모델을 따라야 할 것임을 입증해 보였다.
더불어 스스로 군사 점령을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책임 대국'의 면모를 선보일 수도 있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유엔(UN)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는 데 사활적이었다. 계절적인 영향도 있었다. 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겨울이다. 혹한 속에서 보급로가 길어지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마오가 거듭 한국 전쟁의 경험을 복기하고 한반도에서의 실패를 반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인도 남진을 지속하다가는 38선 이남으로 진격했을 때처럼 미국과의 장기전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던 것이다. 나아갈 때 이상으로 그치고 멈출 때를 따지고 있었다. 실은 인인해방군의 38선 이남 진출이 패착이었음은 베트남에서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북)베트남의 프랑스에 대한 '민족해방전쟁'은 돕되, 남베트남을 '해방'시키는 '통일 전쟁'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에서도 중국의 후방 지원은 17도선 이북으로 한정되었다. 인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한반도에서처럼 미-중 간 전면전만큼은 피하고자 심사숙고했던 것이다.
중국이 벵골과 아삼 진격을 포기한 1년 후, 케네디 대통령은 댈러스에서 암살당한다. 1963년 11월이었다. 케네디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것은 약 1000일에 그쳤다. 혹여 중국이 남진을 지속하여 기어이 제2차 미중 전쟁을 촉발시켰다면, 케네디는 임기 말년을 전쟁 지휘로 보냈을지 모른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갤브레이스 또한 대학으로 돌아갔다. 1964년 5월에는 네루 역시 숨을 거둔다. 케네디의 암살, 네루의 사망, 그리고 갤브레이스의 학계 복귀로 '인도 모델' 프로젝트는 조기에 마감되는 듯했다.
'전환 시대'
2008년 '검은 케네디'로 불리는 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이다. 그가 인도를 처음 방문한 해가 2010년이다. 두 번째 방문은 더욱 각별했다. 2015년 1월 '공화국의 날'에 초대받았다. 모디 총리의 옆에 서서 인도군의 열병식을 지켜보았다.
더 중요하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웃 국가 파키스탄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 동맹국 파키스탄보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 인도를 더 중시했던 것이다. 중국에 맞서 인도를 키우자는 갤브레이스의 '인도 모델'론이 재차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 오바마가 뉴델리에 머물고 있을 때, 파키스탄의 최고 실력자 샤리프 장군은 베이징에 있었다는 점이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으로 파키스탄을 중시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전천후 친구'와 '철의 형제'라는 최고 수위의 수사를 주고받았다. 같은 날 CNN과 BBC는 뉴델리의 오바마를 주목했고, CCTV와 알자지라는 베이징의 샤리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세력 균형이 정초된 것도 1962년 중인 전쟁 이후이다. 1950년대 미국과 파키스탄이 반공주의로 하나가 되었던 동맹 체제에 균열이 드러났다. 중인 전쟁에 대한 관점이 판이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대국주의를 화근으로 지목했다. 대영제국의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려는 '제국몽'에 혐의를 두었다.
반해 미국은 냉전 구도로 접근했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 이어 남아시아까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든다고 여겼다. 미국의 인도 지원은 남한과 남중국(대만)과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맹국의 배반으로 접수했다. 어떻게 동맹국이라며 제1적성국 인도를 돕는단 말인가. 미국에는 글로벌 냉전이 중요했고,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가 관건이었다. 양국의 시선이 엇갈렸다.

▲ 인도-중국-파키스탄으로 삼분된 카슈미르. ⓒwikimedia.org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긴 파키스탄이 주목한 나라가 중국이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앞서 중국과 먼저 카슈미르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되, 사용권을 획득하는 타협을 이루었다. 그 결과 건설된 것이 바로 카라코룸 고속도로이다. 신장의 카슈가르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잇는 세계 최장의 고속도로이다.
당시 국경선 확정 작업을 이끌었던 이가 외교부 장관 부토였다. 파키스탄을 반공주의로부터 탈피시키는데 선봉장 노릇을 한 인물이다. 서파키스탄의 고속도로에 이어, 동파키스탄에서는 다카와 상하이 사이에 직항로까지 개설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봉쇄 전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파키스탄 기지를 통한 티베트 공작도 중지시켰다. CIA는 작전의 거점을 인도와 네팔, 라오스 등지로 옮겨야 했다.
1965년 카슈미르에서 발발한 제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결정타였다. 미국은 동맹국 파키스탄을 지원하지 않았다. 도리어 인도군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재무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카슈미르에서 양국이 미국산 무기로 다투었던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1965년 미국의 관심은 카슈미르가 아니라 온통 베트남이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인도차이나 전체가 적화되고 있었다. 이 모든 사정을 지켜보고 있던 부토가 파키스탄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는 해가 1971년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파키스탄을 이끌고자 했다. 부토가 주도했던 파키스탄의 '전환 시대'는 다다음주에 따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짚을 곳은 펀자브가 아니라 벵골이다. 미국에서 케네디-갤브레이스와는 전혀 다른 조합이 등장했다. 닉슨과 키신저이다.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었다. 민주주의를 맹목하지 않는 만큼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파격을 선보였다.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화해만 주목한다. 1972년 닉슨-마오 회동을 탈냉전의 기폭제였다고 높이 기린다. 그래서 데탕트라거나 '전환 시대'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남아시아를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할에 이어, 1971년에는 파키스탄마저 분할되었다.
동벵갈이 동파키스탄이 되었다가 방글라데시로 귀착된 것이다. 1947년 제1차 분할에 못지않은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닉슨-키신저와는 깊이 관련되었고, 마오-저우언라이와도 무관치가 않은 사태였다.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와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와 동서 냉전이 겹겹으로 교착되어 폭발했던 것이다. 1971년, 벵골로 간다.
[유라시아 견문] 대분할 ⑤ : 방글라데시
68 혁명이 낳은 나라, 방글라데시
벵골 르네상스
다카 공항의 출구를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열기와 습기가 동시에 덮쳐온다.
40도 더위는 이미 익숙해졌다. 30도만 되어도 청량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북인도 내륙부의 그 타는 듯한 더위가 아니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다. 괴롭기로는 후자가 훨씬 더하다. 매번 새 도시에 가면 하염없이 마냥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다. 사전 정보 없이, 선입견 없이, 그곳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는 의례이다. 부러 저녁나절에 서너 시간을 걸었는데도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깔끔한 성격이 아님에도 두세 차례 씩 속옷과 티셔츠를 갈아입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도 건조하여 머리칼까지 빳빳해지던 펀자브와는 자연환경부터 판이하게 달랐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터전은 벵골 델타이다. 히말라야와 벵골 만을 잇는 곳에 자리한다. 갠지스 강도 지나간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데다가, 하늘에서는 비도 많이 내린다. 봄에는 히말라야의 설산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고, 여름이면 몬순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먹구름이 밀려와 장대비를 쏟아 붓는다. 24시간 동안 1미터의 비가 내린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강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대지를 뒤덮는 경우도 있다. 홍수가 일면 영토의 70%가 물에 잠기기도 한다. 눈물과 빗물, 강물과 바닷물, 방글라데시는 단연 물이 만든 나라이다.
풍부한 수량은 벼농사에 적합했다. 구태여 저수지를 만들 것도 없었다. 연중 벼를 재배할 수 있었다. 쌀은 밀보다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한다. 예로부터 벵골에 사람이 많았던 까닭이다. 과연 바글바글, 득실득실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보도를 넘어 차도까지 점령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것만 같은 끝없는 人波(인파)였다. 그 사이를 뒤집고 걸어다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고행이었다. 악명 높은 자카르타와 마닐라의 교통 체증도 이미 경험해 보았지만, 다카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는 생지옥이었다. 무덤덤한 표정의 그들이 경이로울 지경이었다.

ⓒ이병한

ⓒ이병한
방글라데시는 큰 나라이다. 국토의 3면이 인도에 둘러싸인 형세를 보거나, GDP가 낮은 형국만으로 소국인양 착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1억6000만 명, 세계 8대 인구 대국이다. 미국의 절반이고, 러시아나 일본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그 많은 인구가 그리스만한 영토에 몰려 살아간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 인구의 90% 가까이는 또 무슬림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이 이집트와 이란 인구의 2배에 육박한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잇는 세계 3대 이슬람 국가이다.
벵골 만과 히말라야만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인문 지리의 만남도 남다르다. 동과 서가 여기서 만났다. 영국과 인도가 처음 만난 곳이 벵골이었다. 1757년 6월, 동인도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이 회사를 시작으로 영국은 100년 후 남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영토와 인구로 따지자면 벵골이 영국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즉, 대영제국 역시 벵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의 강남 지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농업 생산력이 월등한데다, 동인도와 동남아의 해상 무역망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기도 했다.
벵골에 터를 잡은 대영제국은 점차 펀자브의 무굴제국을 잠식해갔다. 그러나 인도 아대륙에서 반복된 기왕의 제국 교체사와는 달랐다. 유라시아형 대륙 제국이 아니라 유럽형 해상 제국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본주의의 도입에 있었다. 경제 운영의 이념과 목표가 달랐다. 제국의 장기 지속이 아니라, 최단 기간 최대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다. 농작물 재배부터 달라졌다. 먹고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업이 되었다. 이른바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다. '현금 작물'이라고도 했다. 현지인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 시장의 소비자를 위한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다.
대표적인 상품이 아편과 차였다. 벵골에서 재배한 아편은 중국에 내다팔고, 다즐링과 아삼에서 키운 차는 영국과 유럽에 수출했다. 즉, 벵골은 중국과 유럽 간의 대역전, 이른바 '대분기'와도 무관치 않은 장소였다. 벵골산 아편으로 골병이 들어간 대청제국에 결정타를 날린 이들은 펀자브 출신 용병들이었다.
대영제국의 흉만 보는 곳은 공정하지 못하겠다. 벵골은 동방과 서방,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이 조우하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콜카타는 남아시아의 정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18세기 초까지 벵골의 중심은 다카였다. 영국으로 인해 콜카타가 벵골의 제1도시로, 아니 런던 다음으로 가는 대영제국의 제2도시로 비상한 것이다.
영국은 1830년대부터 벵골에서 무굴제국의 지배 언어였던 페르시아어 사용을 폐지시켰다. 대신 영어 학교를 보급하고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었다. 콜카타 대학교가 들어선 것이 1857년이다. 다카 대학교는 1921년에 세워졌다. 특히 콜카타 대학교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다음 가는 명성을 누렸다. 여기서 소위 '벵골 엘리트'들이 양성되었다. 벵골 델타의 지주 집안 자제들이 콜카타로 몰려들었다. 학력 자본을 축적하고 교양인으로서 빅토리아풍 아비투스를 습득해갔다. 인디아 잉글리시, 힝글리시(Hindi+English)의 기원이다.
동서 문명의 융합도 일어났다. 콜카타에서 산스크리트어와 영어가, 힌두 문학과 영문학이 혼합되었다. '벵골 르네상스'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와 영어는 물론 벵골어와 페르시아어에 도 능통한 르네상스 인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타고르이다. 20세기 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강력한 추천으로 일찌감치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였다. 대영제국의 문학 망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 타고르의 할아버지가 아편 무역의 중개상이었음이 인상적이다. 할아버지는 영국-인도-중국을 잇는 물류의 개척자였고, 손자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잇는 문류의 선구자였다.
타고르는 훗날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가(國歌)가 될 노래도 지었다. 물론 조국 인도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할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콜카타 대학교만으로는 족하지 못했다. 동서 문명의 융합을 사표로 삼는 산티니케탄 학교를 세운다. 훗날 국제 대학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 배출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바로 아마트리아 센이다. 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1998년이고,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13년이다. 두 인물 모두 벵골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하지만 두 번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벵골의 지난 20세기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아무리 '벵골 르네상스'라고 추켜세워도 식민지는 식민지였다. 식민지 근대성이 아무리 휘황했다 한들 식민지로서의 본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벵골의 고난도, 방글라데시의 비극도, 대영제국 시기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 다카 대학교 도서관. ⓒ이병한

▲ 다카의 타고르 기념관. ⓒ이병한
동벵골과 동파키스탄
벵골 르네상스는 대영제국의 독배였다. 갈수록 벵골 엘리트 사이에서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당장 타고르부터 동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서로는 이란과 터키를 주유하며 유럽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범아시아주의의 기운을 고조시켰다. '동방의 등불'에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중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의 첫 대응은 벵골의 분할이었다. 1905년 벵골을 절반으로 갈라서 서쪽만 벵골이라 하고, 동벵골은 아삼에 갖다 부쳤다. 그리고 동벵골-아삼의 주도는 다카로 삼았다. 콜카타와 다카를 분리 지배한 것이다. 서벵골은 힌두 문화, 동벵골은 이슬람 문화라며 전형적인 분할 통치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자충수였다. 도리어 벵골 민족주의에 불을 붙였다. 콜카타에서도 다카에서도 분할 반대 열기가 고조되었다. 덩달아 '인도 민족주의'마저 강화되었다. 벵골 출신의 열혈 민족주의자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대표적이다. 콜카타의 영국 총독부가 달아오르는 벵골 민족주의에 포위된 형세였다.
결국은 행정 수도를 옮기기로 한다. 콜카타에서 델리로 대영제국의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뉴'델리 건설이 시작되었다. 점진적으로 수도 기능을 이전해서 작업을 완료한 해가 1931년이다. 그 과정에서 뉴델리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델리 대학교다. 1922년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델리에서는 양대 제국의 흔적을 모두 목도할 수 있다. (올드) 델리에는 무굴제국이, 뉴델리에는 대영제국이 자취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수도 이전이라는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영제국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1947년 도망치듯 인도를 떠난다. 20세기 판 '브렉시트'였다. 떳떳할 수 없는 유산도 남겼다. 영국이 떠난 남아시아는 힌두교와 이슬람으로 갈라졌다. 제국이 국가로 쪼개졌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되었다.
1905년 벵골 분할 또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힌두 문화의 서벵골은 인도로 편입되었고, 무슬림이 많은 동벵골은 동파키스탄이 되었다. 벵골 영토의 64%, 인구의 65%가 파키스탄으로 편입되었다.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서로 1500킬로미터나 떨어진 기형적인 모양의 근대 국가였다. 그 꼴을 두고 코끼리(인도의 상징)의 양 귀에 비유하기도 했다.
작위성의 모순은 건국 직후부터 표출되었다. 영토는 서파키스탄이 훨씬 넓었지만, 인구는 동파키스탄이 더 많았다. 1951년 첫 번째 인구 통계에 따르면 7800만 파키스탄인 가운데 4400만, 약 56%가 동파키스탄에 살았다. 종교로 하나의 국가가 되었으나, 양 지역을 가른 것은 언어였다. 국어부터가 말썽이었다. 표준어 제정이 난항이었다. 국가의 중심은 펀자브에 있었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언어는 벵골어였다. 결국 펀자브어도 벵골어도 국어가 되지 못한다. 우르두어가 제1언어가 되었다. 페르시아어의 변종으로 이슬람에 가장 가까운 언어였다.
당장 벵골 엘리트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어 선정은 지역적 자부심, 문화적 정체성, 민주와 자치의 원리에 그치는 사안만이 아니었다. 생계 유지와 사회적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었다. 벵골인들의 중앙 권력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벵골에서 우르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는 3%에 불과했다.
역사의 소산이다. 벵골은 무굴제국에는 가장 늦게 편입되고, 대영제국에는 가장 먼저 복속된 지역이다. 그래서 우르두어는 끝내 생소한 반면에, 영어가 훨씬 익숙했다. 게다가 총인구의 56%가 쓰는 벵골어를 국어로 삼자는 요구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다. 불만이 증폭되는 반면으로, 건국 열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펀자브인은 그들 나름으로 불만이었다. 벵골인들을 대영제국의 끄나풀이었다고 흘겨보았다. 산스크리트어와 그 파생어인 벵골어 등도 힌두 문명에 '오염'된 흔적이라고 간주했다. 잠재적인 친인도파가 될 수 있다며 꼬아본 것이다. 본인들이야말로 이슬람제국이었던 무굴제국의 정통이자 적통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페르시아 문명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를 표방한다면 응당 펀자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우르두어를 국어로 삼는 것 또한 동벵골, 즉 동파키스탄을 '이슬람화'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벵골어를 지우고 우르두어로 통일함으로써 순수한 '민족 문화'를 일구어야 했다.
펀자브와 벵골 간 뒤틀린 심사는 선거 국면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1954년 최초의 총선에서 파키스탄 건국의 주역 무슬림연맹은 동파키스탄에서 참패한다. 309석 가운데 7석을 얻는데 그쳤다. 한 지붕, 딴 살림이었다. 신생 국가로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익숙한 경로가 이어졌다. 군부가 실력 행사에 나섰다. 1958년 쿠데타를 일으켜 계엄령을 발포한다. 군부는 입법부보다 더더욱 펀자브로 쏠린 조직이었다. 당시 장교 가운데 동파키스탄 출신의 비중은 3%에 불과했다. 벵골에서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펀자브에서는 군인들을 차출했던 대영제국의 유산이 파키스탄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쿠데타 이후 행정부 또한 90%가 서파키스탄인으로 채워졌다. 벵골인은 명백한 2등 국민이었다.
군사 정권은 벵골의 '지방 문화'도 탄압했다. 표적이 된 것이 타고르이다. 그의 책은 금서가 되었고, 시와 노래도 금지시켰다. 덕분에 타고르의 상징성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의 생일인 2월 21일은 '벵골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유사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 벵골어로 노래를 부르고, 벵골어로 시를 낭송하고, 벵골어로 서파키스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기존의 연방제 국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국가 연합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방과 외교만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재정과 무역 등 내정은 모두 지방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 화폐까지 따로 발행하는 통화 주권까지 요청했다.
서파키스탄은 벵골인들의 이런 행태를 인도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며 몰아 붙였다. 동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을 자극하는 인도의 내정 간섭으로 폄하한 것이다. 마치 인도가 카슈미르의 자치 요구를 파키스탄의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 것과 판박이 논리였다. 펀자브, 카슈미르, 벵골 등 분할된 지역에서의 지방 정치가 남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작동 양상을 규정해간 것이다.
1970년 두 번째 총선은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또 다시 표심이 완전히 갈라졌다. 동/서 파키스탄을 아우른 전국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동과 서에서 각자의 지역 정당이 압승하는 구도가 굳어졌다. 파키스탄을 국가 연합으로 재편할 것인가,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할 것인가, 중차대한 기로에 섰다.
내전과 전쟁
1970년 총선 당시 동파키스탄의 인구는 60% 비중으로 늘어났다. 의석수의 6할을 차지했으니 벵골인이 총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펀자브의 군인은 벵골의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할 뜻이 전혀 없었다.
표심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물리력이었다. 동파키스탄 다카에서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야히아 칸(Yahya Khan)이 서파키스탄의 라호르에 도착하자, 무력 진압이 시작되었다. 벵골 민족주의를 청산하고 통일 파키스탄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순식간에 야당 당사는 쑥대밭이 되었고, 다카 대학교 캠퍼스는 청년들의 무덤이 되었다.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벵골 분리주의자'라며 무차별 발포했다. 다카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다. 지도부는 인도의 서벵골로 피신하여 콜카타에 망명 정부를 세웠다.
당시 다카에 있던 미국의 영사관에서는 군인의 민간인 학살, 펀자브인의 벵골인에 대한 '인종 학살' 소식을 거듭 본국으로 타전했다. 동맹국 미국이 제공한 탱크와 전투기, 장총과 소총으로 대학살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시각각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묵묵부답이었다. 공식적인 비판은 물론이요, 비공식적인 엄포도 없었다.
도리어 야히아 칸을 엄호하고 사수했다. 당시 백안관의 주인은 리처드 닉슨이었고, 그의 배후에는 헨리 키신저가 있었다. 그들은 파키스탄 군부의 최고 실력자 칸을 편애했다. 주저앉힐 의사가 전혀 없었다. 미국의 방조와 묵인 속에서 20세기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로 기록될 벵골 대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닉슨과 키신저의 머릿속은 온통 중국이었다. 원대하고 담대한 비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었다. 중국과의 대화해이다. 중국과 타협함으로써만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칸이 바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 통로였던 것이다. 키신저와 저우언라이는 칸을 통하여 접촉하고 있었다.
리얼리스트 키신저는 냉정했다. 동파키스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인도차이나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만큼이나 개의치 않았다. 중국과의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국공 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진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벵골인들의 죽음은 역사적 대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피해'였을 따름이다. 중국 역시도 칸을 만류하지 않았다. 평화 공존 5원칙의 첫 번째 철칙, '내정 불간섭'을 허울 좋은 구실로 삼았다.
다급해진 것은 인도였다. 난민들이 밀려들었다. 동벵골에서 서벵골로 1000만 명의 피난민이 쏟아졌다. 서벵골과 아삼 일대의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가뜩이나 서벵골은 인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곳이었다. 인도공산당의 아성이었고, 문화 대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마오주의자도 기승을 부렸다. 자칫 벵골의 동과 서가 합세하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지도 몰랐다.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 했다. 명분은 그럴 듯 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이웃 나라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보스니아와 르완다 등에서 일어난 사태의 전조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마이클 왈저 같은 국제 정치학계의 거물도 인종 학살에 맞선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으로 1971년을 즐겨 거론한다. 가장 최근에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드로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의 터키 유입을 막는다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며 방글라데시 사태를 예시했다.
결국 동/서 파키스탄 내전이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선전선동도 펼쳐졌다. 파키스탄의 실상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펀자브 패권주의 국가'라며 동벵골인의 운명을 홀로코스트에 빗대었다. 동벵골의 민족 해방 전쟁을 인도가 돕는다는 것이다. 속내는 조금 더 복잡했다. 인도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참에 동파키스탄을 지도 위에서 지워낼 수 있었다. 양방향에서의 안보 위험을 덜어낼 수 있던 것이다. 방글라데시를 별도의 국가로 떼어냄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력차를 더 벌릴 수도 있었다.
기가 막힌 것은 소련이 인도의 개입을 막후 지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구도는 기존의 냉전 구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물밑 협상 중이었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의 배후에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자리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미국-중국 화해는 1972년에 이루어졌고, 소련-인도의 상호 방위 조약은 1971년에 체결되었다.
소련과 결별한 중국이 미국이 구축한 태평양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한 것은 1979년(개혁 개방)이다. 바로 그해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준 군사 동맹국 인도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1970~80년대 인도는 소련과의 협업으로 남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의 비동맹 노선을 따를 뜻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파키스탄과의 두 차례 전쟁 모두 승리하지 못했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으나, 본인은 파키스탄에 승리했을 뿐더러 아프가니스탄 점령에도 일조했던 것이다.
인도인은 그녀를 힌두교의 전쟁 여신 두르가(Durga)에 빗대었고,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도운 것은 인도 외교사 최대의 치욕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인도의 개혁 개방은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부터 단행되었으니, 중국과 인도 간의 12년 격차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여하튼 1971년 방글라데시를 둘러싸고 전개된 유라시아의 세력 재편은 가히 '전환 시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지각 변동 수준이었다. 기존의 냉전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 소련, 중국, 인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간에 펼쳐진 냉혹한 국제 정치의 산물이었다.
혁명과 건국
동벵골의 비극에 미국 수뇌부는 냉담했지만, 미국인마저 외면하지는 않았다. 1971년 8월 뉴욕에서 '방글라데시를 위한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린다. 조리 해리슨과 밥 딜런 같은 유명한 가수들도 동참했다. 그들이 얼마나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실상을 알았는가는 미지수이다. 나의 감으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것 같다. 미국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이 미국의 동맹국인 파키스탄 군부의 민간인 학살까지 옮아갔을 법하다.
실제로 1971년 방글라데시 건국에는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를 넘어서는 지구적 수준의 연동과 파장이 작동했다. 1968년, 68 혁명이 그것이다. 68 혁명이야말로 동서 냉전 구도를 교란시킨 원조였던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의 정글에 폭탄을 퍼붓고 있을 때, 소련은 체코를 점령하여 '프라하의 봄'을 진압했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공모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라는 비판적 인식이 분출했다. 동서 진영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냉전 체제에 순응하는 자국 정부를 향해 총궐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베이징에서, 도쿄에서 반란에 반란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기왕의 68 혁명 연구 또한 서유럽과 미국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좌파들도 서구 편향적이기는 매한가지다.
당장 68 혁명은 남아시아의 파키스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니 학생들의 반란 가운데 가장 성공한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방의 68 혁명이 국가 권력의 탈환과 재편에 실패했다면, 파키스탄에서는 방글라데시의 분리 독립이라는 '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도 1947년 이후 대학생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68년 당시 다카 대학교의 재학생은 5만 명에 이르렀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만 7000명이었다. 저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읊고, 마오쩌둥과 호치민을 읽었으며,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체 게바라를 흉내 냈다. 고위 공직자나 법률가가 되어 출세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공장에 위장 취업하거나 농촌으로 하방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개개인은 퍽이나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을 것이다. 다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구본을 돌리며 당시를 회감하노라면 일종의 청춘 트렌드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도 힘들어진다.
실제로 1968년은 파키스탄에서 TV 방송이 시작된 해이다. 1967년 말 카라치와 라호르 등 서파키스탄에 먼저 방송국이 생겼고, 1968년 초에는 다카에도 기지국이 들어섰다. 비록 국가 검열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968년 지구촌 대학생들의 반란과 봉기가 실시간으로 전해진 것이다.
특히나 파키스탄의 식민 모국이 영국이라는 점은 꽤나 중요했다. 전 지구적 정보망의 허브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타리크 알리(Tariq Ali)를 꼽을 수 있다. 이 이름이 익숙한 분이라면 꽤나 '진보적인' 독자라고 하겠다. 영국의 신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를 이끈 유명한 지식인이다. 나도 20대 시절에는 그의 글을 읽으며 허영심을 채웠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름에 분명 '알리(علی)'가 새겨져 있음에도 그의 출신에는 미처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그가 바로 파키스탄의 68세대였음을 이제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참에 뒷조사도 해보았다. 펀자브의 라호르가 고향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도련님이었다. 다만 이슬람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 모두 공산주의자였다. '모태 좌파'였다.
소싯적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영국식 교양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눈에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파키스탄 군사 정부는 '후진적'이었을 것이다. 알리는 10대 시절부터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 아들의 장래가 걱정된 부모는 그를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 보냈다. 그러나 토질이 달라진다 해서 기질마저 바뀔 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교내 트로츠키파의 수장이 되어 학생회장 자리까지 꿰찬다. 학생운동을 지휘하며 영국의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이도 알리였다.
동시대 파키스탄의 대학생에게 타리크 알리는 문화적 아이콘, 시대의 영웅이었다. 1969년 그가 잠시 모국으로 귀국했을 때 공항은 알리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다. 적어도 파키스탄에서만큼은 동시대의 비틀즈에 못지않은 열광적인 인기를 누린 것이다. 바로 그 알리의 후예들이 동벵골의 급진적 정파를 이루었고, 대안적 정당을 만들었으며, 기어이 방글라데시라는 또 하나의 국가 권력을 창출해냈던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건국 이념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였다. 반공주의 이슬람국가 파키스탄과 결별한 것이다.
68 혁명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과점 정치가 이어졌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서독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양당 체제가 지속되었다.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에서는 일당 체제가 건재했으며, 일본에서도 자민당이 주도하는 1.5당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파키스탄에서만 68 세력이 반문화/대항 문화에 그치지 않고, 대항 권력을 창출하고 대안 권력에 도달한 것이다. 1968년에는 1958년 이래 군사 독재를 지속하던 아유브 칸 정부를 무너뜨렸고, 1971년에는 또 다른 군사 독재자 야히아 칸으로부터 방글라데시를 쟁취해냈다.
그러나 1947년에 이은 1971년의 두 번째 건국 또한 결코 수월하지가 않았다. 나라를 건사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난제였다. 더군다나 두 번의 대학살과 전쟁 이후의 나라 세우기는 더더욱 힘겨운 노릇이었다. 벵골이 경험한 파란만장한 현대사 때문인지 예상보다 글이 훨씬 길어지고 있다. 1971년 이후의 방글라데시는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한다. 인구 1억 6000만 명의 대국이라면, 두 주를 할애하는 것이 마땅하고 온당한 대접인 것도 같다.
[유라시아 견문] 대분할 ⑥ : 방글라데시 : 역(逆)근대화
방글라데시는 왜 가난한 나라가 되었나?
다카 : 혁명 도시
방글라데시는 혁명 국가였다. 68 혁명이 산출한 유일한 현실 권력이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표방했다. 일괄 '인민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국명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라 했다.
더불어 근대적인 국민 국가였다. 종교적인 근대 국가를 표방한 파키스탄과 척을 졌다. 종교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신생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었다. 파키스탄 건국이 1947년이고, 이스라엘은 1948년이다. 1971년 방글라데시는 성/속 분리, 정/교 분리를 공식화했다. 이슬람이라는 보편 문명 대신 민족 문화를 앞세운 것이다. 파키스탄의 펀자브와도 다를뿐더러, 인도의 서벵골과도 차별성을 지니는 '고유한 민족성'을 창달해야 했다.
다카가 대타항으로 삼은 것은 콜카타이다. 콜카타는 영어 교육에 익숙한 엘리트주의의 산실로 지목했다. 브라만주의의 유산도 남은 힌두 도시라고 폄하했다. 반면 다카는 '혁명 도시'였다. 민중주의, 인민주의, 토착주의를 강조했다. 무굴제국과 대영제국의 유산은 모두 기각시켰다. 전자는 봉건주의로, 후자는 제국주의로 배타했다. 오로지 벵골 민족주의만을 높이 기렸다. 1906년 타고르가 지은 "My Golden Bengal"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의 국가로 삼았다. 제국에서 국가로, 보편 문명에서 민족주의로, 전형적인 서구형 근대화의 궤도에 올라탄 것이다.
곧장 국어 공정과 국사 공정이 개시되었다. 페르시아도 영어도 우르두어도 공론장에서 사라졌다. 벵골 어의 기원인 산스크리트 어마저 배척당했다. 벵골 어 전용론이 득세했다. 국사는 단연 민족 해방사로 채워졌다. 영국 제국주의, 힌두 근본주의, 파키스탄 패권주의에 맞서 싸운 '100년의 고난'을 영웅적으로 기록했다. 벵골 어 운동을 주도한 문인들과 전쟁을 이끌었던 군인들을 주인공으로 위인 전기도 편찬했다.
남아시아 현대사도 바로 세우려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을 분기점으로 삼는다면, 방글라데시는 1971년을 획기로 친다. 1971년 전쟁 또한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부른다. 1971년에 가서야 남아시아에 잔존하던 제국주의/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세 개의 독립 국가로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법을 '탈식민주의적인 도전'이라며 열변하는 다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앞에서 나는 대놓고 대꾸하지는 않았다. 분명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복합성을 이해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곰곰 따져보아도 20세기 남아시아의 획기는 1947년인 것 같다. 1947년의 대분할이 없었다면, 1971년의 소분할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 국가의 행보는 오래가지 못했다. 수많은 제3세계 신생 국가의 운명을 피해가지 못했다. 처지는 더욱 엄혹했다. 1971년 전쟁으로 1947년 이후 건설된 사회간접시설마저 죄다 파괴되었다. 다카 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고급 인력의 손실 또한 막대했다. 서벵골로 피난 간 사람들 가운데 살길이 막막한 이들만 방글라데시로 귀환하고, 재력과 학력을 갖춘 이들은 콜카타에 남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방글라데시의 지도자들 또한 국정 운영에 미숙했다. 동파키스탄 시기 중앙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탓에 훈련과 숙련이 모자랐다. 거버넌스는 부실했고, 민간 역량도 부족했다. 자연이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다. 1974년 대홍수가 난다. 대기근이 잇따랐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결국 파키스탄 시절과 비슷한 경험이 이어진다. 군부가 나섰다. 1975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얄궂게도 1970~80년대 방글라데시의 궤적은 1950~60년대 (동)파키스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규모가 축소된 채 반복되었다. 군부의 무력을 통해서만이 간신히 질서가 유지되었다. 군사 정부가 물러난 것은 1990년이다.

▲ 다카 무슬림. ⓒ이병한
치타공 : 역(逆)근대화
2016년, 건국 이념 전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주의는 구태여 말할 것도 없겠다. 민주주의도 위기다. 선거라는 요식만 남았다. 양대 정당 모두 '봉건적'이다. 각기 다카와 치타공에 거점을 둔 지역 할거 정당이다. 정당 문화도 후지다. 토호들의 가문 정치, 세습 정치가 만연하다. 애초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라는 정당 정치가 작동하기 힘든 토양이다.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이고, 노동자 계급은 주로 중동에서 일한다. 생활 세계는 압도적으로 이슬람을 따른다.
거버넌스의 부실이 뜻밖의 공간을 열어주기도 한다. 기층 단위에서 비정부기구(NGO)의 활약이 눈부시다. 대표적인 것이 그라민 은행이다. 빈곤 여성을 위한 소규모 융자를 제공했다. 그 창의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 벵골은 노벨 문학상(타고르), 노벨 경제학상(센), 노벨 평화상(유누수) 수상자를 배출한 이례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찰하니 과장의 혐의가 없지 않다. 1억6000만 명을 감당하기에는 그야말로 소규모이다. NGO의 뜻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비정부기구이다. 정부와 생산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NGO의 역할은 한정되기 마련이다.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하루 2500원 남짓 수입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해결하는데 NGO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도 전 지구적이자 동시대적인 현상,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앓고 있다. 민주인가 독재인가가 본질이 아닌 것도 같다. 대다수 방글라데시 인에게 공화정과 군주정, 민주정과 군사정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항만에 배가 들어오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지는 않을지언정,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지속될 것이라는 '항상성'이 가장 긴요하다. 진보와 발전이 아니라 항산과 항심을 원한다. 대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이 예외적으로 지속된 20세기의 매우 이례적인 정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부실한 민주주의를 매워주었던 것은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 또한 갈수록 모순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제2도시 치타공부터 불만이 팽배하다. 놀랍게도 치타공 시민의 다수는 벵골 인이 아니었다. 복장부터 다카보다는 미안마의 양곤이나 만달레이에 흡사했다. 남자들은 긴 치마 같은 론지를 두르고 있고, 여자들은 얼굴에 흰색 분칠을 한다. 봄맞이 축제도 인도 아대륙의 홀리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송크란을 따른다. 불교도의 비중도 상당하다. 페르시아 세계보다는 만다라 세계에 속해 있던 곳이다.

ⓒworldatlas

▲ 치타공 항구. ⓒ이병한
치타공은 항만 도시이다. 예로부터 세계 도시였다. 포르투갈 어, 아랍 어, 아라칸 어, 미얀마 어가 벵골 어와 뒤섞였다. 벵골 만 세계와 인도양 세계의 허브였던 것이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무슬림이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갈 때면 중간 항구로 삼는 곳이 치타공이었다. 반대 방향으로는 포르투갈 상인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했다.
이베리아 반도부터 아라비아 해의 고아(Goa)와 남중국해의 마카오와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연결시켰던 해양 제국 포르투갈도 치타공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이슬람의 문류망과 유럽의 물류망이 이곳에서 교차했다. 바다 사람에게 '벵골 민족주의'는 답답한 틀이었다. 치타공은 열린 세계가 그리웠다.
그 왕년의 연결망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복구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쫓겨난 무슬림계 소수 민족 로힝야 난민의 거주지가 바로 치타공이다. 치타공에서야 로힝야 족의 계보를 살펴볼 생각이 들었다. 무굴제국과 미얀마 사이에 자리했던 아라칸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인도 아대륙과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연결망이자, 벵골 만 세계의 주역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들이 '소수 민족'으로 떠돌이 신세가 된 것 또한 국민 국가와 국가 간 체제가 이식된 '장기 20세기'의 사태이다. 따라서 '민주화된' 미얀마 정권에 소수 민족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빤한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쉽사리 해결될 사안도 아니라고 하겠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사이에서 유연하고 부드럽게 작동했던 '벵골 만 세계'를 복원해가는 집합적 과제와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로힝야 족도 기왕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치타공의 활력 또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로힝야 족 난민 캠프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연결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정부기구, 종교이다. 종교 단체는 시민 단체보다 훨씬 오랫동안 활약했던 대표적인 NGO이다.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이 아니라 이슬람 NGO들이 난민 보호를 이끌고 있다. 이 이슬람 연결망 또한 유구하고 유장한 것이다. 14세기 모로코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이르렀던 인물이 이븐 바투타였다.
헌데 사시 눈이 없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된 조직들이 푼돈으로 로힝야 족을 테러리스트로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생거짓말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었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기왕의 페르시아 문명의 수피즘과는 다른 와하비즘을 전파하고 있음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카에다가 중동과 동남아를 잇는 중간 거점으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실제로 마지막 남은 건국 이념인 세속주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재)이슬람화의 물결이 도저하다. 이슬람 난민촌, 이슬람 고아원, 이슬람 구제소, 이슬람 병원 등이 버섯구름처럼 퍼지고 있다. 덩달아 검은 천으로 온 몸을 덮은 부르카 복장의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드라사, 즉 이슬람 학교의 숫자가 중고등학교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다카 대학교의 그 역사학자는 '벵골 르네상스'를 자랑했던 지역의 고유함과 독자성이 약화되고, 이슬람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깊이 탄식했다. 문명사가보다는 민족사학자였다.
도시화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민이 유입될수록 가족과 친족, 마을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소속감은 상실된다. 고독한 도시인들이 더욱 자주 모스크를 찾는다는 것이다. 다카의 현재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30만 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2025년이면 2500만 명의 메가 시티가 될 것이다. 2000만 무슬림이 살아가는 거대한 이슬람 도시가 등장하는 것이다.
정치가 생활 세계의 변동과 무관할 수가 없다. 양대 정당마저 갈수록 이슬람으로 기울고 있다. 기층 사회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이슬람 조직들과 연계해야 표를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이슬람의 입김은 더욱 커져간다.
세속주의를 고수하는 '구세력'과 이슬람의 귀환을 추진하는 '신세력'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학교이다. 아이들을 일반 학교로 진학시킬 것인가, 이슬람 학교로 보낼 것인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공립 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각기 청소년기를 마친 엘리트들이 조우하는 장소는 대학이다. 세계관의 차이가 현저하다. 세속주의 지식인과 언론인이 구타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문명의 충돌'이다.
혁명 국가의 쇠락이 비단 방글라데시에 한정된 현상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일개 국가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유라시아 전체의 대세이다.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막론하고 재이슬람화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구대륙의 구문명이 再起(재기)하고 있다.
하여 정보화니 세계화를 서구화나 미국화와 등치시키는 독법은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다. 도리어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종교야말로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1500년의 문명이 최첨단 기술과 뉴미디어와 결합하여 100년의 근대 정치를 잠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16억이 소통하는 아랍 어 공론장을 외면해서는 21세기를 파악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 반전하는 역(逆)근대화(De-Modernization)의 풍경과 의미는 이슬람 세계로 서진하면서 더욱 소상하게 따져보려고 한다.

▲ 로힝야 족 난민 캠프. ⓒ이병한

ⓒ이병한
인류세
다카에서 치타공까지는 버스를 이용했다. 거리는 250킬로미터. 서너 시간이면 도착할 줄 알았다. 웬걸, 장장 8시간이 걸렸다. 직행 버스가 없다. 완행버스이다. 중간 중간 정거장에 섰다. 킨들로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고속도로가 아니었다. 군데군데 비포장도로마저 있었다. 교통망이 부실하다. 실은 교통뿐만이 아니다. 전력도 부족하다. 호텔에서도 수시로 전기가 나간다. 인터넷도 깜빡깜빡했다. 석탄과 석유 등 지하자원을 가장 덜 쓰는 나라이다. 태양과 대지와 물, 그리고 인간의 근력에 의존해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이다.
어쩔 수 없이 창밖으로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망망한 벵골 델타의 풍경을 원 없이 바라보았다. 허리를 구부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보인다. 저들은 3000년 전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는 풍경을 장탄식하며 지켜보는 모습 또한 수백 년째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의 하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꼴은 가장 오래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내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은 5월 초였다. 아직은 하늘이 쾌청했다. 몬순이 비를 뿌리기 전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6월 첫날에 비가 내린다고 말한다. 치타공에서 비가 오고 닷새가 지나면 콜카타에서도 비가 내린다. 그리고 또 닷새가 흐르면 뭄바이에서도 비가 온다. 6월 중순에는 뉴델리를 적실 것이고, 7월 초에는 카라치까지 이를 것이다. 하늘은 남아시아 대분할 체제의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차례차례 비를 뿌려간다. 인도양의 몬순은 수천 년째 반복되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큰 기후 체제이다.
그 몬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후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 홍수부터 잦아졌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점점 더 많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몬순 시즌이 되면 바닷물이 영토를 잠식할 정도로 방글라데시는 저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이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 또한 가장 먼저 받지 않을 수 없다. 2030년까지 해수면이 20센티미터 상승하면, 치타공과 그 일대 1000만 명이 위험해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50년이면 방글라데시의 절반이 바다에 잠식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벵골 만은 점점 더 넓어지고 벵골델타는 줄어들고 있다. 지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가이아임을 실감한다.
방글라데시는 인류의 활동이 가이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로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시시비비가 이곳 방글라데시에서 판별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에 감사해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정체(停滯)된 것으로 여기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진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근대 정치가 지속되는 한 임박한 파국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내가 재이슬람화의 물결을 마냥 '퇴행'이라고만 재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근본적 까닭이다.
[유라시아 견문] 신파키스탄 : 이슬람 사회주의
핵을 꿈꿨던 지도자, 미국이 처단했나?
재출발
1971년은 1947년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심리적, 감정적 동요가 엄청났다. 인도의 대분할은 파키스탄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슬람 국가의 분리 독립을 간절히 바랐다. 반면 파키스탄의 분할은 기필코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방글라데시의 분리 독립을 저지코자 했다. 그러나 무산되었다. 나라의 동쪽 날개가 떨어져나갔다. 적대적 경쟁국 인도에 군사적으로 완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토와 인구의 절반마저 잃어버렸다. 파키스탄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렸다. 정체성과 정당성 모두 흔들렸다.
고립감도 증폭되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컸다. 무굴제국 이래 남아시아의 주역이라 여겼던 펀자브의 자부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인도-방글라데시가 합작하여 선동하는 '펀자브 패권주의'는 뼈아픈 대목이었다. 서파키스탄의 다른 주에서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연 파키스탄이 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운 지경이었다. 그간 나라를 이끌어온 군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 인물과 새 정치가 절실했다. 그때 등장한 이가 줄피가르 알리 부토이다. 위기의 파키스탄을 도맡아 국가 재건을 주도했다. 20세기 후반 남아시아 지도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사상가에 값하는 정치인이었다.
부토는 1928년생이다. 대영제국기의 말미에 태어났다. 명문가의 자제였다. 가학으로는 이슬람을 전수받고, 가정교사에게는 영국식 교육을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에는 뭄바이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퍽이나 조숙했던 모양이다. 무슬림연맹 대표 지나에게 편지를 쓴다. 사사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는 코란과 마호메트의 적이라며, 우리(무슬림)의 사명은 파키스탄 건국이라고 했다. 국민회의와 타협하여 통일 인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당장은 학생이라 기여할 수 없지만, 파키스탄을 위하여 제 삶을 바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다짐도 새겼다. 일종의 충성 서약이었던 셈이다. 말은 씨가 되었다. 훗날 조국이 그의 숨을 거두어간다.
1947년 파키스탄이 탄생하던 해, 그는 미국으로 떠났다. 남캘리포니아주립대학(USC)에 입학한다. 몸은 캘리포니아였지만, 마음은 펀자브에 있었다. 학생 잡지에 열정적인 기고문을 투고한다. 대분할의 수천만 희생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건국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조국에 투사했다. 당시 USC는 '플레이보이를 위한 학교'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베벌리힐스에서 유유자작하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부토와는 기질이 맞지 않았다. 곧 샌프란시스코로 학교를 옮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는 정치학 공부에 전념했다. 마키아벨리, 홉스, 흄, 토인비까지 두루 읽었다. 동시대 정치인 중에는 네루를 주목했다. 그의 비동맹 외교가 외세에서 자유로운 독립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고 여겼다. 인도를 적대하면서도 취할 것은 취했던 것이다.
역사적 인물 가운데는 나폴레옹을 역할 모델로 삼았다.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의 21살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한 책이 나폴레옹 전기였다. 가죽 양장으로 포장된 다섯 권짜리 대작이었다. 카를 마르크스 역시 아버지가 소개해 주었다. 다음 생일의 책 선물이 <공산당 선언>이었다. 실제로 나폴레옹과 마르크스는 부토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폴레옹에게서 권력의 정치를, 마르크스에게서 가난의 정치를 배웠다고 술회한 바 있다.
버클리 캠퍼스 또한 캘리포니아 좌파의 거점 같은 곳이었다. 부토 역시 사회주의 서적을 열독했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가 이슬람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접수했다. '이슬람 사회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버클리 다음으로는 대서양 건너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한다. 식민모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이 또한 아버지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
귀국 직후부터 부토는 출세가도를 달린다. 금수저의 특혜를 한껏 누렸다. 집안 인맥이 원체 든든했다. 1957년 유엔(UN)의 파키스탄 대표부에 발탁된다. 약관 30세, 파키스탄은 물론이요 당시 유엔 대표단 가운데서도 가장 어렸다. 1958년에는 상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역시 최연소 장관이었다. 1960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승진하고, 1963년에는 외교부 장관이 된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앉게 된 것이다.
외교부 장관이 되면서부터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토는 민족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며 이슬람교도였다. 당장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베이징 방문과 마오쩌둥과의 회동으로 일약 국제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발칵 뒤집힌 것은 워싱턴이었다. 파키스탄은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동맹국이었다. 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공(Chi-Com)'의 수뇌와 악수를 나눈 것이다. 곧장 아유브 칸에게 압력을 가한다. 부토의 자질과 재주를 아끼던 칸도 패권국의 압박을 버텨낼 수는 없었다. 결국 1967년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부토를 도리어 키워준 꼴이었다. 금수저 관료에서 '인민의 지도자'로 거듭났다. 1967년 7월 21일, 부토의 퇴임 연설을 듣기 위해 라호르에 인민들이 집결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이 많았다. 파키스탄의 68 혁명에는 두 명의 영웅이 있었다. 런던의 타리크 알리, 그리고 펀자브의 부토이다. 양자 간에 차이는 있었다. 알리는 천상 지식인이었다. 런던에서 좌파 잡지를 편집하며 담론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부토는 정치인이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역사를 만들어갔다. 아유브 칸의 반대편에 선 대항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물 들 때 노 저어야 한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 연설을 시작했다. 그 기세를 모아 11월 30일 파키스탄 인민당도 창당했다. '이슬람은 우리의 신념, 민주주의는 우리의 정치, 사회주의는 우리의 경제,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를 표방했다.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출발이었다. 기어이 아유브 칸을 끌어내린다. 68 혁명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전면적 승리는 아니었다. 또 다른 군인 아히야 칸이 권력을 계승했다. 다만 1970년 총선을 약속했다. 부토는 파키스탄 인민당을 중심으로 범좌파 연합을 주도했다. 그리고 서파키스탄에서 압승을 거둔다. 1971년 방글라데시가 분리 독립하고 아히야 칸 정부가 붕괴되자, 서파키스칸에 남은 것은 부토와 파키스탄 인민당뿐이었다. 자연스레 부토에게 권력이 이양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다. 반공주의 군사 독재 국가에서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면적인 변화였다. 파키스탄 판 '전환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슬람 사회주의
1973년 새 헌법이 발포된다. 의회제로 운영되는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했다. 부토는 초대 총리가 되었다. '사회주의 파키스탄'이라는 새 정치에 나선 것이다. 건국 이래 지난 25년과 정반대의 방향이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아 입안한 '반공주의 개발 독재'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렇다고 소련식 공산주의를 추수한 것도 아니었다. 과학적 사회주의, 신이 없는 사회주의를 사절했다. 이슬람 사회주의, 즉 알라와 더불어 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천년의 문명에 백년의 이념을 결합시켰다. 이성과 영성의 조화를 꾀했다.
1972년 철강과 전력, 화학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 1974년에는 은행도 국유화시켰다.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의 권한도 대폭 강화시켰다.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직접 소농과 소작농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부패와의 전쟁도 펼쳤다. 행정부와 군부의 고위 인사 2000여 명이 퇴출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책들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도 다분히 의식적으로 '무사왓'이라는 단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무사왓은 평등을 뜻하는 코란 속의 아랍어이다. 최신의 사회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래된 이슬람 정신을 만개시킨다는 속뜻을 담고 있었다.
교육 정책도 인상적이다. 기왕의 마드라사를 고수한 것도 아니고, 군사 정부 아래 영미식 교육을 지속시킨 것도 아니다. '마드라사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의 임기 중에 6500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었다. 900개의 중학교도 만들어졌다. 고등학교는 407개였다. 전문 대학은 51개, 일반 대학은 21개를 세웠다. 그 모든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학교와 교회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성과 속을 공존시켰다. 이성을 연마하는 한편으로 영성도 고양시키고자 했다.
1974년 이슬라마바드에 콰이드 이 아잠 대학과 알라마 이크발 개방 대학이 들어선다. 콰이드 이 아잠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의 우르두어로 건국의 아버지 지나를 기리는 대학이며, 후자는 파키스탄의 철학적 기초를 세운 시인이자 사상가인 무하마드 이크발을 받드는 대학이다. 두 학교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학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이다. '이슬라마바드'라는 새로운 수도 이름에 걸 맞는 이슬람학의 메카를 지향한 것이다.
종교만 앞세우지도 않았다. 과학도 동시에 발전시켰다. 1975년에는 이크발의 이름을 딴 의과대학도 세워진다. 1974년 나티아갈리에서는 해외 과학자와 파키스탄 과학자가 교류하는 국제 물리학 대회가 처음 열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6년에는 이론 물리학 연구소도 세운다. 핵무기를 자체 개발한 파키스탄의 물리학 발전 또한 부토의 진두지휘에 의한 것이었다. 이슬람은 오래전부터 수학, 화학, 의학 등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일군 문명이었다. 20세기의 현대 과학과 전혀 배타적이지 않았다.
또 다른 혁신 대학으로 이슬라마바드의 인민 개방 대학을 꼽을 수 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고등 교육의 혜택을 베풀었던 국립 대학이다. 신파키스탄이 지향하는 '이슬람 사회주의'를 체현한 대표적인 교육 기관이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파키스탄은 온통 '교육 혁신 국가'였다.

▲ 부토와 마오쩌둥. ⓒwikimedia.org
범아시아주의와 범이슬람주의
그래도 부토 하면 역시 외교 정책이다. 1950년대 인도에 네루가 있었다면, 1970년대 파키스탄에는 부토가 있었다. 1966년 8월 런던을 방문한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공식 방문이었지만, 타리크 알리와의 사적인 만남도 있었다. 알리의 초청으로 파키스탄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와 제3세계 연합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파키스탄의 야심찬 비전을 제시한다.
허장성세로 그치지도 않았다. SEATO와 CENTO 모두에서 탈퇴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기구에서 자진 사퇴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다. 1965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서는 (북)베트남 편을 들었고, 1967년 발발한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아랍 편을 들었다. 기존의 친미 노선을 철회하고 주체 노선으로 갈아탄 것이다.
1969년 그의 세계관과 정치적 비전을 집약한 <독립이라는 신화(The Myth of Independence)>라는 책도 출간한다. 그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읽어 보았다. 짧지만 단단한 글이었다. 단숨에 읽힐 만큼 선동적이기도 했다. 1970년대 세계 학계를 풍미하는 사미르 아민의 종속 이론과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선취하고 있었다.
명민한 지성의 부토는 가슴마저 뜨거운 야심가였다. '전환 시대'가 자신을 요청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심에 불타올랐다. 인도의 네루는 이미 죽었고(1964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군사쿠데타로 축출되었다(1965년). 중국은 문화 대혁명(1966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마오쩌둥도 저우언라이도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호치민 역시 전쟁 수행에 급급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다. 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유엔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경험도 풍부했다. 동쪽으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북조선을 방문했고, 서쪽으로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순회했다. 서독과 동독을 동시에 방문한 뒤, 폴란드와 소련을 찾아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도 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잇는 자리에 파키스탄이 있었고, 소련과 중국을 접한 곳에 파키스탄이 있었다. 유라시아의 가교 국가로 파키스탄을 다시 자리매김했다.
그의 신아시아 구상에서 핵심은 중국이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유대가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제3세계의 발전과 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운명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도 그였다. 중국 없이는 아시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처음 개진한 인물이 부토였다. 부토의 조언을 경청한 예외적인 지식인이 미국에도 한 명 있었다. 바로 헨리 키신저이다. 키신저가 중국의 문을 열어간 '전환 시대'의 행보는 부토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었다. 닉슨이 마오쩌둥과 악수를 나눈 것(1972년)도 부토(1963년)보다 10여년 늦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친중파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겠다. 동쪽으로 편향되지도 않았다. 동시에 서쪽을 향하여 범이슬람주의도 내세웠다. 그는 신심 깊은 무슬림이었다. 무신론이 뿌리 깊은 유교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근본적인 상이점이 있었다.

▲ 1974년 2월 라호르에서 개최된 범이슬람회의. ⓒwikimedia.org
1974년 2월 라호르에서 개최된 범이슬람회의(Pan-Islamic Summit)가 상징적이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38개 이슬람 국가들이 참여한 성대한 국제 행사였다. 일순 파키스탄이 이슬람 세계의 중심인 듯 했다. 알제리의 민족 해방 전쟁 승리를 기리고, 팔레스타인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했다. 부토는 이집트의 나세르부터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앞에 두고 열정적으로 연설/설교했다. 진정한 이슬람은 동/서를 가르지 않고, 물질/정신을 나누지 않는다며, 파키스탄이 물질주의적 서방과 정신주의적 동방의 가교가 될 것이라는 웅장한 구상도 피력했다.
핵 국가 파키스탄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것도 범이슬람회의에서였다.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문명 모두 핵무기를 가졌다. 신앙을 배타한 양대 공산주의 국가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오로지 이슬람 문명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핏대를 세웠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부조리한 국제 질서의 산물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1974년 이슬라마바드에서 범이슬람회의와 국제물리학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출된 행보였다.
그러나 이슬람과 핵무기의 결합은 미국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태였다. 부토를 만류하기 위해 급파된 인물이 또 키신저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회는 불쾌하게 끝을 맺는다. 한때 중국을 통한 냉전 돌파라는 기획에서 의기투합했던 두 인물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압박하는 키신저를 홀로 남겨두고 부토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적막이 흐르는 빈 방에서 리얼리스트 키신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토의 최후와도 직결되는 순간이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977년 재차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슬람 사회주의' 아래서 영향력을 상실해가던 군부의 청년 장교들이 앞장섰다. 부토는 엉뚱하게 살인 혐의로 피소되었다.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와 인연을 맺었던 해외 지도자들이 석방과 선처를 요구했다.
특히 부토의 연설에 감화 받고 영감을 얻었던 카다피는 리비아 망명이라는 타협책을 파키스탄 군부에 제시했다. 부토를 리비아로 이송하기 위해 파견된 특사가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1주일이나 대기했다. 그러나 끝내 사형이 집행되었다. 1979년 4월 4일, 부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사법 살인이었다. 이슬람 세계 전체가 경악했다.
음모론이 무성하다.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문서로 드러난 바는 (아직) 없다. 진실은 키신저의 비밀 메모나 CIA의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밝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황 추론만 가능하다. 미국의 사전 승인이나 교감 없이, 혹은 묵인하겠다는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부가 뒤 짚을 수 있었을까?
4년 전 남태평양 건너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 전복이다. 미국이 보기에 부토는 아옌데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사회주의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핵무장 이슬람 국가마저 추진하고 있었다. 우연찮게도 부토가 사망한 바로 그해, 동북아시아의 한 독재자도 암살당한다. 그 역시도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6개월의 시차가 난 부토의 사형과 박정희의 암살은 전혀 무관한 사태였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언할 수가 없다.
부토의 처형 이후 파키스탄은 미국에 충성하는 동맹국으로 회귀했다. 걸프만 산유국들의 오일 달러를 수호하는 역할이 파키스탄 군부에 맡겨졌다. 펀자브 출신 장교들과 군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으로 파견되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건설을 사수하는 역할도 이들이 수행했다. 대영제국 아래 펀자브가 했던 역할을 고스란히 계승한 것이다. 이득이 없지 않았다. 아니 상당했다. 중동의 오일 머니가 파키스탄 군부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었다. 무력에 금력까지 갖춘 독보적인 집단이 되었다.
부토가 제거된 이듬해(1980년) 미국의 한 젊고 똘망똘망한 국무부 관료가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그리고 '파키스탄 안보 보고서'를 작성한다. 파키스탄의 군사 독재 유지가 오일 달러의 사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작성자의 이름이 퍽이나 흥미롭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이다. 1989년 '역사의 종언'이라는 희대의 논문을 발표한 바로 그 후쿠야마이다. 키신저부터 후쿠야마까지, 적지 않은 미국의 브레인들이 파키스탄을 주목했던 것이다. 그만큼 파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정학의 요충국가이다.
부토는 갔지만, 그의 글은 남았다. 꽤나 많은 글을 남기고 갔다. 한데 모아서 논문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일만큼 흥미로운 지점도 많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원형이라고 함직한 내용도 엿보인다. '이슬람 사회주의'를 양 날개로 크게 펼쳐 유라시아 전체를 아울렀다. 사회주의 국제주의와 범이슬람주의와 범아시아주의를 통합하고자 했다. 그래서 베를린부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까지 가닿는 경제 합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눈을 찌르는 대목은 그의 유라시아 구상에서 일본은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이 커지는 것은 곧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은 진술이다. 번뜩이는 직관이고, 예리한 통찰이다.
1979년 그는 갔지만, 그의 소망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해 중국과 이란에서 '장기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동시에 발진했다. 중화 세계의 귀환과 이슬람 세계의 중흥을 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두 방향의 역사 조류는 목하 일대일로를 통하여 하나의 대세로 합류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일대와 일로를 잇는 연결 국가라는 점, 중국과 중동 사이에 자리한 가교국가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부토의 사상과 구상에서 이미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先見之明(선견지명)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지난 백 년을 회고하며 다른 백 년을 다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의 무덤 앞에서 오래 묵념했다.

▲ 부토의 이슬람식 영묘.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유라시아의 대반전은 계속된다
터키-필리핀은 왜 '악마'가 되었나?
'유라시아 견문' 1년 6개월째이다. 3년 계획, 반환점을 돈다. 글은 여전히 인도양에 머물러 있지만, 몸은 이미 이슬람 세계 깊숙이 들어왔다. 이란과 터키를 지나 아라비아 반도이다. 이쯤에서 유라시아의 중간 판세와 판도를 점검해 볼까 한다. 남아시아에 주력하는 사이 원체 굵직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중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기도 했다. 그때그때 신속한 논평을 내놓고 싶은 마음을 꾹꾹 담아두었다. 한국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하나씩 짚어간다.
영국/유럽
21세기 유럽사는 브렉시트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필적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동서 분열을 딛고 대통합으로 향하던 유럽의 거대 서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다. 향후 2, 3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EU 붕괴는 성급하고 일면적인 진단 같다. EU 상층부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이탈을 기다렸다는 듯, 군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음을 눈여겨볼 만하다. 브렉시트 직후 열린 6월 28일 EU 정상 회담에서 <유럽의 세계 전략을 모색하는 보고서(EU Global Strategy 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Shared Vision, Common Action : A Stronger Europe)>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EU가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입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3년 이래 13년 만이다. 그 사이 강산은 크게 변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분기점이다. 그리스를 비롯 남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통합 화폐 유로마저 흔들린다. 안보 위협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랍의 봄'은 IS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아랍과 유럽은 이웃지간이다. 난민과 테러가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유로피안 드림'은 궁색해졌다. 이 난세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독자적인 세계 전략이 제출된 것이다. 북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유럽의 안정과 직결된 주변 지역으로 설정했다. 나라면 '서유라시아'라고 했을 것이다. 서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EU의 군사 통합을 제안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속사정이 간단치 않다. EU와 NATO의 반목과 갈등은 해묵은 것이다. 특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더욱 증폭되었다. EU 국가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민과 난민을 관리하는 것이 유럽 안보의 핵심이라 여겼다. 그러나 NATO는 화력을 엉뚱한 곳으로 쏟았다. 동유럽으로 세력팽창을 거듭하여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영미의 군산 복합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NATO가 정작 유럽의 안정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을 속으로 삭혀왔던 것이다.
아다시피 NATO는 냉전의 산물이다.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맞서는 대항 조직이었다. 더불어 전범국 독일을 관리하는 성격도 짙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선봉에 섰다. 문제는 탈냉전 이후에도 그 속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체는커녕 더욱 확산되었다. 반면 EU는 탈냉전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태생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 EU와 NATO를 연결하는 고리, 더 정확하게 말해 EU가 NATO의 우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지해온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다. 즉, 영국을 매개로 미국은 유럽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돌연 '직접 민주주의'의 결과로 브렉시트가 일어난 것이다. EU와 NATO를 결박시켰던 주박이 황망하게 풀려나버렸다.
때를 맞춤하여 독일에서도 신안보 전략 백서가 발표되었다. 지난 7월 13일이다. 독일이 군사안보 백서를 발표한 것 또한 10년만이다. EU의 신세계 전략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독일의 군사력 확대를 통하여 EU의 군사 통합을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독일이 NATO와 무관하게 해외에 파병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고,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하여 해상 방위 활동도 할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독일은 유럽서도 난민 유입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최근에는 테러까지 발생했다. 이 모든 사태에 미국의 중동 정책, 이른바 '체제 전환'의 실패가 있다고 여긴다. 백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이다. 메르켈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녀는 사민당 출신이다. NATO를 통제하는 방법은 EU 독자의 군사 통합밖에 없음에 기민당과 사민당이 합의한 꼴이다. 즉 독일의 군사 백서 발간은 1945년 이후 미국의 패권 아래 있었던 독일의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깝다. 독일 주도 아래 EU의 군사 통합이 실현된다면, 이 또한 미국에 대한 유럽의 '독립선언'에 방불할 것이다.
독일만 독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작년(2015년) 11월 파리 테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전 유럽을 망라하는 치안 강화책을 제창했다. 그런데 그 안보 정책을 제기한 장소 역시 NATO가 아니라 EU였다. 이참에 살펴보니 유럽의 군사 통합화는 물밑에서 착착 전개되고 있었다.
네덜란드 육군의 상당 부분이 독일 육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 독일 해군의 일부 또한 네덜란드 해군에 통합되어 있다. 독일과 폴란드의 군사 통합도 추진되고 있고, 체코도 독일과의 군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의 군사 독립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다. 앞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 같다.
다만 EU 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EU 헌법인 리스본 협정에 위배된다.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EU 의회의 외교위원장 입에서 이미 관련 진술이 나왔다. 그것도 브렉시트 직후인 6월 26일이었다. EU 통합참모본부의 모델로 독프합동여단을 제시했다. 독프합동여단은 탈냉전 초기에 만들어진 군사 조직이다. 이를 EU로 확대시킨 유럽합동군(Eurocorps)도 1993년부터 창립되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 5000명, 양국 이외의 국가에서 1000명을 파견하고 있다. 다만 영미의 군산 복합체가 NATO만으로 충분하다는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기에, 독프합동여단도 유럽합동군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EU와 NATO의 분리는 세계사적 획기가 아닐 수 없다. 대문자 "West", 즉 歐美(구미)가 분리되어간다. 유럽과 미주가, 더 구체적으로 서유럽과 북미가 동떨어져간다. NATO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점은 퍽이나 상징적이다. 대서양 연합이 느슨해지는 것이다. 당장 영국의 이탈로 EU는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 러시아 압박과 봉쇄 국면에서 탈피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에 EU 인사가 다수 참가했다. EU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이탈리아 총리와 그리스 총리도 얼굴을 내밀었다. 구/미가 느슨해지면서, 장차 유럽의 정체성 또한 재정초될 듯하다. 유럽/아시아, 유라시아의 일원으로서 '오래된 유럽'이 (재)등장할 것이다. 신대륙과는 점점 멀어지고, 구대륙과는 다시 가까워질 것이다. 신/구간의 일대 반전이다.
터키/중동
7월 15일 밤과 16일 새벽은 터키 현대사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쿠데타가 좌초되었다. 현장에 있었다. 이란 생활을 마치고 막 터키로 옮겨온 차였다. 아침형 인간이다. 10시면 잔다. 글도 아침에만 쓴다. 일찍 잘수록 생산력이 는다. 탓에 격동의 밤을 지켜보지 못했다. 두고두고 아쉽다.
새벽 산책에 나섰다가 길거리의 탱크와 장갑차를 보고 기겁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제야 스마트 폰을 열었다. 이스탄불 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다. 생중계되고 있는 알자지라 방송의 특파원 옆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속보를 쓰는 기자들이 부러웠다.
그런데 현장과 보도 사이 낙차가 심했다. 이스탄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쿠데타를 저지했다는 자부심이 승했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 케말 아타튀르크 이래 터키 현대사 또한 군인들이 주도해왔다. 민간 지도자가 군부에 의해 제거되는 역사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처음으로 무력에 의한 정권 전복 시도를 시민들이 막아낸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를 국민들이 지켜낸 것이다. 그러나 구미의 보도는 터키인들의 의사와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판단을 보류하거나 폄하했다. 터키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다.
CNN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을 "포위된 대통령"으로 묘사했다. NBC의 특파원은 에르도안이 독일로 망명할 것이라는 트위터를 날렸다(가 지웠다). 쿠데타 진압이 완료되자 FOX는 "터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논평을 냈다. BBC 홈페이지는 "터키의 무자비한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하루 종일 메인에 걸었다.
<뉴욕타임스>는 에르도안 지지자들을 '양(sheep)'에 빗대었다. "에르도안의 명령에 따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폭력적인 군중"이라는 칼럼까지 실렸다. 자작극이라는 음모설까지 보태었다. 편집 또한 자의적이었다. 혹은 악의적이었다. 에르도안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 갈등을 묘사하는(부추기는?) 사진들이 넘쳐났다.
독재자의 탄압과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상투적인 이미지가 전시되었다.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스탄불과 너무나 달랐다. 내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던 이스탄불 지식인들과 시민들과도 전혀 달랐다. 재차 <1984>의 빅브라더를 떠올렸다. 다시금 세계의 주류 매체에서 '교조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근본주의'가 설파되고 있었다. 오리엔탈리즘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증폭되고 있었다.
쿠데타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아래로도 훑어볼 필요가 있다. 터키의 외교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던 시점이다. 터키의 아래로는 시리아가 있다. 터키의 위에는 러시아가 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한 양국의 접근이 전혀 달랐다. 터키는 미국과 NATO편에 섰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제거하려 했다.
정작 IS 격퇴는 뒷전이었다. 아니 뒷문을 열어 IS 팽창에 일조한 것이 터키였다. IS에 지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터키의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들어갔다. 미국과 NATO도 묵인했다. '테러와의 전쟁'보다 '체제 전환'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 반대편에 러시아와 이란이 있었다. 두 나라는 아사드 정권을 도와 IS 퇴치에 앞장섰다. 시리아 내전은 일종의 준 '세계 대전'이었고, 터키와 러시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즐겨 읽던 러시아 언론들도 몽땅 차단되어 있던 것이다.
이 교착 국면에서 에르도안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과 합작하여 시리아 내전 종식에 나서기로 했다. 푸틴과의 정상 회담도 예정되어 있었다. 마침 그때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누가 이익을 보았을 것인가? 터키는 NATO 가맹국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핵심 국가이다. 미국의 중동 정책을 매개하는 국가였고, 러시아 압박의 최전선에 자리한 나라도 터키였다.
에르도안이 쿠데타의 배후로 미국과 서방을 정조준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고 있다. 이참에 군대, 학교, 언론 등에 근거지를 둔 친서방파 혹은 자유주의파와 세속주의자를 일망타진하고 있다. '외부 세력'과 공모하는 내부자를 발본색원하고 있다. 야당까지 일치단결이다. 51%로 당선된 에르도안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내정 간섭' 혐의가 먹혀든 것이다. 선전과 선동에 능란하다. 100만 명이 운집한 이스탄불 집회는 터키가 '다른 백 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에르도안은 마치 술탄인양 보였다.
실은 쿠데타 진압 과정부터 무척 인상적이었다. 에르도안이 세속주의의 보루 군부에 맞서 동원했던 것이 바로 이슬람 네트워크였다. 전국에 퍼져있는 모스크를 통해서 쿠데타에 맞서줄 것을 호소했다. 코란의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는 확성기를 통하여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그 방송을 들은 시민들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으로 에르도안의 메시지를 전송, 재전송했다. 순식간에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격을 분쇄했다. '디지털 이슬람'이 세속주의 군부를 이긴 것이다. 백 년만의 대역전, 대반전이다.
터키는 오스만제국 붕괴 이래 100년간 서구화를 국책으로 삼았던 나라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구미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발버둥 쳤다. 10개월간 기껏 고생해서 배운 아랍어가 이스탄불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근대화를 한답시고 아랍어도 버리고 로마자 알파벳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턱 밑에 자리한 냉전의 파수꾼이자, 미국의 중동 정책을 매개하는 첨병이었다.
에르도안은 이 100년의 실험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새천년 집권 이래 탈서구화와 재이슬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로 EU 가입의 매력이 확 떨어지던 차였다. 터키식 '재균형'이고 '신상태'이다. 일각에서는 NATO 탈퇴와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전망하기도 한다.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다.
다만 더 이상 터키가 신냉전 획책의 졸로 그치지 않을 것임만은 분명하다. 재차 이슬람 문명을 기저로 유라시아의 한 축이 될 것이다.
필리핀/남중국해
7월 12일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관한 헤이그 판결이 났다. 처음부터 이상한 재판이었다. 중국과 필리핀이 당사자 간 협의로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 1995년이다. 20년 가까이 별 문제가 없었다. 별안간 필리핀 단독으로 제소한 것이다. 해양 분쟁 조정은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절차가 진행되었다.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아닌 고로 상주하는 판사들도 없다. 제소가 들어오면 판결을 내릴 배심원을 선발한다. 즉 중국 입장을 대변할 사람도 없이 판결이 진행된 것이다. 그럼 누가 재판 과정을 주도했는가?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이다. 그가 배심원 5명을 선발했다. 야나이는 누구인가? 전직 주미 일본 대사이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극우파 인사이다. 헤이그 판결에 가장 환호했던 나라도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일본-필리핀의 해양 동맹이 가동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필리핀에서 큰 변화가 생겨났다. 정권이 바뀌었다. 중국과의 협상을 일방으로 거두고 헤이그로 달려갔던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물러났다. 그는 임기 중에 자국의 군사 기지를 미국에 재차 내준 인물이다. 그 아키노의 후계자를 500만 표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정권을 접수한 이가 로드리고 두테르테이다.
선거 직후부터 독자 노선을 천명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정확한 설명과 보고 없이는 미군이 필리핀 기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헤이그 판결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판결 선고 이틀 후에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할 계획까지 밝혔다.
라모스는 1995년 합의를 이끈 장본인이다. 그때처럼 남중국해의 공동 이용, 공동 개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대신에 중국이 필리핀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건설 등 인프라 정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편이 미군의 항공모함이 수빅 만에 돌아오는 것보다 이롭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견해이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선거 기간 그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했다. "필리핀의 트럼프"라며 혹평했다. '교조적 민주주의자'들의 교묘한 프레임이다. 두테르테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리얼리티 쇼의 스타가 아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인사이다. 그가 다스렸던 도시가 다바오(Davao)이다. 필리핀 견문 당시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한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연상시키는 무정부적 도시였다고 한다. 마약에 찌든 범죄자들의 소굴이었다. 그 곳을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두테르테였다. 마닐라에서 만났던 월든 벨로 또한 두테르테와 친분이 있었다. 미군의 필리핀 재진입과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하셨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선거 경쟁에서 한참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역사를 복기하며 도출한 '속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도 한 몫 했던 것 같다. 식민지와 동맹국으로 100년을 지낸 필리핀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플 파워'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오판이었다. 반성한다.
두테르테는 자칭 '사회주의자'이다. 필리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사회주의자가 당선되었다. 최초의 좌파 정부가 탄생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좌/우는 부차적이다. 상/하의 역전, 흙수저의 반란이다. 식민지와 속국에 기생하며 대대손손 호가호위했던 필리핀의 지배 계급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아래서 지속되었던 가문 정치와 토호 정치, 격차 사회에 대한 시정이 시작되었다. 식민지 근대화와 속국 민주화 100년 동안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세습적 지위를 누렸던 엘리트들에 대한 통렬한 복수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혁명'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터키만큼이나 필리핀에서도 100년만의 대역전이 전개 중이다.
기실 남중국해 문제 또한 100년의 지평에서 조망할 필요가 크다.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 1898년이다. 당시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장이 알프레도 마한(Alfred Mahan)이었다. 20세기 미 해군 전략의 기초를 작성한 인물이다.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무역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에 해군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구상은 미국-스페인 전쟁 승리를 계기로 현실화되었다. 필리핀, 하와이, 괌을 점령하면서 '기지의 제국'이 출발했다.
즉 유럽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는 작금 남중국해 사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과 해양 경계선 또한 대부분 식민모국들이 그어둔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해양 국경으로 갈라진 것은 1529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계는 1842년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은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해양 경계는 1887년 프랑스가 그었다. 필리핀의 해양 경계 또한 1898년 미국과 스페인에 의해서 그어졌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경계는 1930년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그어졌다. 죄다 서세동점의 유산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국경 분쟁을 해소할 수 없었다. 서세가 여전히 드셌기 때문이다. 미/소가 강요하는 냉전 체제에 휘말려 들어갔다. 우파 국가와 좌파 국가로 갈라섰다.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에, 중국과 아세안 간에, 그리고 아세안 내부 국가들 사이에 수많은 공동 개발 사업이 합의되고 이행되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돌연 갈등이 증폭된 것이다. 여기서 재차 '외부 세력'이 등장한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축을 옮기겠다고 한 나라가 있었다. 미국에서 '축의 이동(Pivot to Asia)'이 발표된 것이 2011년이다.
공교롭게도 이듬해(2012년)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했던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조기에 좌초된다. 아베 신조가 정권을 탈환한다. 곧장 중동의 혼란이 동아시아로 이전되었다.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동중국해가 어지러워졌다. 동쪽의 속국 일본이 앞장섰다. 이어서 남중국해도 뜨거워졌다. 남쪽의 속국 필리핀을 부추겼다.
아시아로 축을 옮긴다며 미국이 부가한 조항들이 있었다. 하나는 '더 많은 군사 기지 연결망을 구축할 것',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다. 군사화와 민주화, '속국 민주주의'를 재가동시킨 것이다. 이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다. 당시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이다. 바로 그녀가 올 11월 백악관 입성을 노린다.
다시 백 년 vs. 다른 백 년
7월 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스탄불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를 지켜보았다. 찬조 연설의 면면이 화려했다. 볼거리가 풍성했다.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역시 힐러리의 연설이었다. 불안했다. 섬뜩했다. 오바마보다는 부시 같았다. 클린턴보다는 레이건 같았다. 월가의 장학생이었던 그녀가 군산 복합체의 수호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Stronger Together"라는 구호조차 불길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전쟁의 여신처럼 보였다. 과연 공화당 주류도 속속 힐러리 지지로 돌아설 낌새이다. 네오콘들도 그녀 곁으로 결집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네오콘의 기획을 힐러리가 승계한다. 그녀를 통하여 '다시 백 년'이 가동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도 예외적인 순간이 있었다. 레온 파네타가 연사로 나섰을 때이다. CIA 국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낸 거물이다. 남편 클린턴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다. 힐러리와는 '아시아로의 축의 이동'을 함께 입안했던 인물이다. 그가 트럼프를 비판하자 관중들이 'No More War'를 외치며 파네타를 야유하기 시작했다. 짐작컨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젊은 식자층이 많다. 그들도 잘 알고 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0년을 반복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 폭탄을 쏟아 부은 결과 중동 곳곳이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테러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IS까지도 탄생시켰다. 미국의 후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부채도 남겼다. '난세의 전초 기지'이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작 샌더스이다. 힐러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안타깝다. 처음부터 나라 밖 사정에는 어두운 순진한 좌파 할아버지라는 인상이 강했다.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나라면 결코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뜻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난처함이야말로 수명이 다해가는 근대 민주주의의 곤경이다. 신대륙에서, 아메리카에서, '다른 백 년'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백 년의 기운은 구대륙에서 지핀다. 다시금 무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다. 또 다른 '축의 이동(Pivot to Asia)'이 모습을 드러냈다. 8월 9일, 푸틴과 에르도안이 회동했다. 시리아 내전 해결에 양국이 의기투합했다. 터키로 돌아온 에르도안을 기다리고 있던 이는 이란의 외교부 장관 자리프였다.
이란은 터키 군부의 쿠데타에 가장 단호하게 비판을 가했던 나라이다. 터키 외교부 장관의 기자 회견이 인상적이다. 한 숨도 자지 못한 그날 밤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가 자리프였단다. 다섯 차례나 통화했다고 한다. 러시아와 이란의 정보기관이 터키의 민주주의 사수에 긴밀하게 협조했던 것이다.
에르도안은 곧 테헤란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터키-이란을 축으로 삼는 삼국 연합이 부상한 것이다.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공군이 이란의 기지에서 출격하여 IS를 공습했다. 지난 백 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들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간의 '적대적 공존'을 타개하고 중동에서의 다른 백 년을 추동해갈 것이다. '외부 세력'을 배제해 갈 것이다.
러시아-터키-이란 사이에는 코카서스 지역이 자리한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이다. 8월 8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푸틴과 로하니가 만났다. 러시아-이란-아제르바이잔을 잇는 코카서스 경제 회랑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코카서스를 넘어서는 비전도 제출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부터 인도의 콜카타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푸틴의 회심의 프로젝트, 대유라시아 구상의 일환이다. 그는 마치 몽골세계제국을 경영하던 칸처럼 유라시아의 지도를 거꾸로 뒤 짚어 북에서 남으로 내려다보며 수를 둔다.
이란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언제 핵 합의를 뒤짚을지 모른다. 지금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다. 전례가 없지 않다. 북조선과의 제네바 합의도 9.19 합의도 미국이 파기시켰다. 자력갱생해야 한다. 그럴수록 이웃과의 연결망 재건이 사활적이다. 페르시아 만부터 흑해까지, 아르메니아서부터 불가리아까지 교통 회랑을 건설하고 있다.
이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남부는 아라비아 반도이다. 북부는 중앙아시아이다. 동부는 남아시아이다. 서쪽으로는 터키와 유럽으로 이어진다. 독일부터 인도까지 가닿는 유라시아 연결망의 허브로 이란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본디 페르시아제국의 역할이 그러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페르시아가 이었다.
내친김에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자. 베트남도 몹시 분주하다.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을 전후로 베트남이 미국 편에 섰다는 보도가 빗발쳤다. 오보에 가깝다. 지난 10년 베트남의 친미 노선을 추진했던 응우옌 떤 중 총리는 국가주석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다. 그는 사이공 출신이다. 남베트남, 즉 미국의 동맹국 출신이었다.
도이모이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권을 접수한 세력은 하노이파, 북베트남 세력이다. 그렇다고 친중파도 아니다. 미/중 사이서 균형을 취한다. 러시아에 부쩍 접근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5월 소치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참석한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소치 선언'도 발표되었다. EEU와 ASEAN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양 지역 간 FTA 논의를 시작했다. 즉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통합을 매개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이 또한 20세기의 유산이다. 냉전기 사회주의 국제주의가 유라시아의 경제 통합으로 전변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일대일로까지 포개진다. 6월 17일 시진핑은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을 순방했다. 바르샤바부터 세르비아를 거쳐 베오그라드까지 가는 곳곳 환영받았다. 으레 돈 보따리를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발트해 국가들까지도 신실크로드에 올라타기를 원한다. 상하이에서 베를린까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과 북유럽이 거대하게 엮여가고 있다.
그 한복판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도 있었다. 6월 23~24일 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SCO는 여전히 NATO 같은 군사 동맹 기구가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배타적인 무역 기구도 아니다. 혼종적이고 잡종적이며 융합적이다. 일즉다, 다즉일(unity in diversity)의 원리가 관철된다. 그래서 인도도 이란도 무리 없이 합류했다. 장차 터키까지 합세할 기세이다.
유럽/아시아, 전통/근대, 좌/우, 민주/독재 등 20세기의 온갖 이분법을 돌파하는 거대한 인드라망을 구현해간다. 고로 '문명의 충돌'은 하얗게 잊어도 좋겠다. 충돌이 있다면,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사이,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 당사자와 '외부세력' 간에 있을 뿐이다. 최후의 서세가, 마지막 외세가 독선과 아집에 찌든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거듭 간섭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세와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서세동점의 말기이다. 서구적 근대의 말세이며, 미국적 세계화의 끝물이다. 그러나 탈근대도 아니요, 반세계화도 아니다. 탈근대는 신좌파의 말놀음이요, 반세계화는 구좌파의 게으름이다. 구미적 근대에서 지구적 근대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적 세계화에서 세계적 세계화로 진입하고 있다. 지구적 근대화와 세계적 세계화의 최전선에 유라시아가 자리한다. 구 제국들은 귀환하고, 옛 문명들은 복원된다. 동서고금이 사통팔달 회통한다.
델리에서 이스탄불에 이르는 지난 반 년간, 책상 앞에 걸어두고 노트북의 메인 화면으로 삼고 있는 지도 한 장이 있다. 18세기 유라시아 지도이다. 오스만제국과 사파비드(페르시아)제국, 무굴제국과 러시아제국, 대청제국이 건재하던 시기이다. 산업 혁명이 일어나기 전, 서세동점이 시작되기 전, 유라시아의 판도를 조감해볼 수 있다.
나로서는 어쩐지 2050년의 미래가 당시의 모습과 흡사할 것만 같다. 18세기의 옛 지도에서 21세기의 청사진을 구한다. 엉뚱한 공상인 것인지, 역사적 영감인 것인지, 두 눈으로 두 발로 직접 확인해 보려한다. 이제 격변하는 이슬람 세계로 진입할 차례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세계를 새로이 보게 되었다.
문명화-근대화-민주화로 '근대인'들을 세뇌시킨 지난 100년의 대서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유라시아 견문] IS의 충격
IS 쇼크,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홀렸나?
'시라크' : 개방된 전선
새 거처를 마련했다. 여행 가방 두 개를 끌고 이스탄불과 카이로를 전전했던 보름간의 '난민 생활'을 청산했다. 알렉산드리아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 유명한 옛 도서관이 있던 곳이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이기도 하다. 현대식으로 탈바꿈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재개장한 것이 2002년이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전경에, 후방으로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가 자리한다. 근방에는 아랍문화관과 로마박물관도 있다. 나로서는 안성맞춤한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동네 도서관' 삼아 이슬람 세계와 지중해 세계를, 유럽과 아랍을 아울러 살펴가려고 한다. 서유라시아를 통으로 사고하는 훈련장으로 삼을 것이다.
카이로를 거쳐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는 동안, 숙소서는 늘 알자지라를 틀어두었다. 실은 올해 내내 그러했다. 여전히 7할은 들리지 않는다. 혹은 이제는 3할이나 들린다. 이곳을 떠날 즈음이면 절반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단연 화제는 이슬람국가(IS)이다. 최근 세력이 부쩍 약해졌다. 매일같이 전황 속보가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알레포와 모술이다. 이스탄불에서는 알레포 소식이 잦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단연 모술이 화제이다. 훗날 숱한 역사가들이 저술할 것이 분명한 '모술 전투'가 시작되었다.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자리한 도시이다. 알레포는 시리아의 북부에 있다. 즉 IS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넘나들며 존재했다. 혹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을 돌파하여 '시라크'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 당시 그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러시아가 수긍했던 작위적인 국경선을 철폐했노라 자랑했다. 20세기의 식민주의를 청산한 이정표로 삼은 것이다. 오스만제국 붕괴 이후 국가 간 체제로 재편되었던 아랍 세계에 일대 지정학적 충격을 가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외부 세력'은 물론이요 이라크와 시리아 등 당사국들 또한 IS 퇴치에 사활적인 까닭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가 간 체제로 되돌리고자 함에는 내/외 합작이다. 알레포에서는 러시아와 시리아가 손을 잡았고, 모술에서는 미국과 이라크가 뜻을 모았다. 20세기와 21세기가 격렬하게 충돌한다.
IS가 돌연변이는 아니다. 글로벌 지하드 운동의 점진적 진화의 소산이다. 뉴욕의 상징적 건물에 가공할 테러를 가했던 알카에다보다 진일보했다. 더 이상 산발적이고 단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테러 집단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한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질서를 창출하여 사회를 통치하는 엄연한 국가로서 등장했다.
재차 장소가 관건적이다. 괜히 이라크가 아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긴밀히 연루되어 있다.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었다. 중앙 정부가 해체되었다. 외세에 힘입은 새 정권은 자리를 잡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일어났다. 수많은 비정부조직들이 창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생긴 것이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계기가 2011년에 일어난다. 이른바 '아랍의 봄'이다. 여러 아랍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존 정권이 무너지거나 흔들렸다. 통치되지 않는 무질서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철권을 휘두르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도 파장이 미쳤다. 곧장 내전 상태로 들어갔다. 시리아는 이라크의 이웃 국가이다.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발판삼아 활동 공간을 대폭 확장시킬 수 있었다. 천시가 맞아떨어졌다.
실은 '아랍의 봄' 이전부터 지하드 전사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를 왕래했다. 이 또한 이라크 전쟁 10년의 산물이다. 수많은 지하드 전사들이 반미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라크로 집결한 것이다. 이라크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시리아였다. 아사드 정권도 묵인했다. 아사드는 미국의 체제 전환과 민주주의 이식의 다음 목표가 시리아가 될 것을 우려했다.
미국을 이라크의 수렁에 고착시키고 이라크 전쟁의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가능한 많은 지하드 전사들을 이라크로 투입하는 편이 유리했다. 시리아의 급진 세력들을 이웃으로 송출하는 편이 내치의 측면에서도 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IS라는 영토 국가로 진화하여 자신의 정권을 겨냥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IS가 평지에서 돌출한 것도 아니다. 로드맵이 있었다. 알 수리라는 사상가가 있다. 1958년 시리아에서 태어나 스페인 시민권을 획득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지하드 이론가이다. 한때는 빈 라덴의 측근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미 무장 투쟁의 선전 선동을 담당했다. 그가 글로벌 지하드 이론을 체계화한 저서를 발표한 것이 2004년이다. 무려 1600쪽에 달하는 대작이다.
지금은 인터넷에도 (아랍어로) 공개되어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서 네트워크 지하드 전략을 이론화했다. 나는 10장짜리 요약본만 겨우 읽어보았다. 혹은 겨우겨우 읽어내었다. 읽는 내내 기묘한 기시감이 일었다. 대일본제국의 총력전에 맞서 마오쩌둥이 집필했던 모순론과 지구전론, 근거지론이 연상되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에 맞서는 게릴라 전술, 비대칭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머지않아 대규모 조직화, 무장화의 기회가 오리라고 예측한 대목이다. 1979년 소련의 침공에 맞서 탈레반 정권을 수립했던 아프가니스탄 경험을 모델로 삼아, 중동에서도 새로운 이슬람국가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수리는 이를 '개방된 전선'이라고 불렀다.
그의 예상은 적중되었다. 실제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개방된 전선'이 출현한다. 이라크의 서북부와 시리아의 동북부가 바로 그곳이다. 바로 그 '개방된 전선'에서 IS가 탄생하고 성장해온 것이다. '아랍의 봄'으로 중동까지도 민주화될 것이라 했던 '교조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근본주의'의 허를 제대로 찌른 것이다.
더 더욱 놀라운 것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 계획마저 있었다는 점이다. 각성과 개안, 부활과 변혁, 국가 선포, 전면 대결과 최종 승리에 이르는 7단계로 분류했다. 2001년 9.11 테러가 각성 단계에 해당한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변혁기이다. 2014년에는 실제로 국가 선포가 단행되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쟁은 전면 대결기에 속한다. 그들은 2020년을 최종 승리 시점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4년 후이다. 당장의 전황만으로 IS의 운명에 섣부른 예단을 금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대장정 끝에 연안까지 밀려간 것이 1935년이었다. 1930년대, 누구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예상할 수 없었다. 대일본제국과 중화민국에 견주어 비할 세력이 아니었다. 오지의 토굴에 모여 사는 비적 무리에 가까웠다. 즉 IS의 장래 또한 크게 열려 있다. 보편사의 객관적 법칙일랑 통용되지 않는다. 역사는 시학적 시간이지, 수학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20년,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다. IS가 비단 지정학적 충격에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사상사적 충격이다. 1924년 오스만제국의 해체와 더불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겼던 칼리프 제도를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IS의 출현을 일개 추문으로 기각해서는 곤란하다. 거대한 파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근대적 세계 지도의 한 모퉁이가 찢겨 나가면서, 1400년 이슬람 문명의 굵은 통뼈가 그 실체를 허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종언'을 조롱이라도 하듯, 역사의 대반격을 펼쳐가고 있다.
칼리프의 재림
이슬람 국가의 선포가 단행된 것은 2014년 6월 29일이다. 최고 지도자 바그다디가 칼리프에 취임한다고 선언했다.
샤리아, 즉 이슬람법을 알아야 한다. 칼리프는 '시라크'라는 영토 국가의 지배자로 그치는 개념이 아니다. 즉,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일국의 지배자는 그저 '부족장'에 그칠 뿐이다. 20세기형 '일국 이슬람주의'는 이슬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칼리프만이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 '움마'의 정치적 지도자에 값한다. 이슬람 세계, 즉 이슬람적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天子(천자) 내지는 황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이 IS의 지도자를 칼리프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칼리프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출현했으며, 그가 일정한 지배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다. 이 놀라움을 '사상적 충격'으로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사고부터 타파해 가야 할 것이다.
IS를 선포하고 칼리프를 선언했던 동영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곳곳에 이슬람적 상징을 차용하여 전 세계에 송출한 기획물이다. 바그다디는 검은 터번을 두르고 등장했다. 검은 터번은 예언자 마호메트의 후손들이 쓰는 것이다. 혈통적 정통성을 과시한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마호메트가 늘 검은 터번을 둘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630년 메카를 (재)정복했을 때 처음 썼다고 한다. 즉, 모술의 점령을 메카의 정복에 빗대었던 것이다. 이슬람 문명사에 무지한 외부인들은 쉬이 간파하기 힘들다. 그러나 무슬림이라면 누구라도 그 의미를 당장 알아챘을 것이다.
6월 29일이라는 시점 또한 상징적이었다. 라마단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었다.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가 단식을 행하는 라마단은 종교적 감정이 특히 고양되는 시기이다. 올해 테헤란에서 라마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단식을 온종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낮에만 곡기를 끊는다. 밤에는 도리어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 일종의 축제 기간이다.
환한 달을 바라보며 모스크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먹는 '아라비안나이트'가 펼쳐진다. 더불어 TV 시청률이 높아지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주요 방송국들 또한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특집 드라마를 편성한다. 그 한 달의 특수를 위하여 1년간 공들여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6월 29일은 그 특집 드라마들의 제1회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다. IS는 바로 그 시점을 노린 것이다. 칼리프의 부활이라는 실사판 대하 드라마를 송출함으로써 단숨에 이슬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탁월한 미디어 전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7월 4일은 라마단 달의 첫 번째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다.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다.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 라마단의 첫 금요 예배는 특히 각별하다. 각국의 주요 모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행해진다. 응당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날에 맞추어 바그다디 또한 설교단에 오른 것이다. 바그다디의 연설은 오바마에 못지않다. 코란 낭독 또한 탁월하다. 물론 나는 그 연설과 낭독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다만 그의 낭독 실력을 인정하는 이슬람 학자들을 여럿 만났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전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오늘을 설파한다고 한다. 신심 깊은 신자들로부터 존경받기 쉬운 유형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동영상으로 유통되는 그의 모습은 그러하다. 그래서 칼리프 부활의 대의에 동의하는 무슬림이라면 호소력이 무척 깊을 것이라고 한다.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했던 이슬람 세계의 '요순시대'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반면 외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잔혹한 참수 영상이다. 이 또한 주도면밀하게 연출되었다. 참수 대상을 선별하고 엄별한다. 미국인이 우선이고, 다음이 영국인이다. 이들 국가의 이라크 및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참수에 앞서 군사 개입 중지를 요구하는 영상을 먼저 내보내 일정 기간을 기다린다. 나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질들에게 오렌지색 수의를 입히는 것 또한 상징적이다.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형무소에서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수인복이 바로 오렌지색이었다. 관타나모 기지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도 오렌지색 수의를 입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IS가 미국처럼, 영국처럼 그 나라를 공습하고 지상군을 파병하여 점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체제 전환'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제도를 이식할 수도 없다. 다만 인질들에게 오렌지색 수위를 입히고 처형함으로써 부당한 대우에 분노했던 이슬람교도들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주고 있다. 이슬람 문명을 회복하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으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한 칼리프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100년간 단절되었던 이슬람식 천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칼리프, 글로벌 스테이트
고로 그들의 사상전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슬람 고전에 기초한다. 권위 있는 이슬람 학자들의 견해를 활용하고, <코란>과 <하디스>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명분을 확인한다. 새로운 건국 이념의 부재, 즉 새로운 사상과 담론을 제시하는 것에 무심한 것이야말로 신생 국가 IS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진리는 이미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보편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거듭 달라지는 국법 위에 이슬람법이 자리한다. 그것이 지난 세기에 깨어져나간 것이다. 근대(Modern)에 대한 발본적인 도전이다.
고색창연한 것만도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이다. 최첨단을 달린다. 뉴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십분 활용한다. 고전적 이슬람을 디지털 매체와 결합시켰다. '디지털 이슬람'으로 전 세계 무슬림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디지털 신대륙이야말로 성전(聖戰)을 전개하는 성역(聖域)이 된 것이다.
2014년 6월 창간한 <다비쿠(دابق)>가 대표적이다. 종이 잡지가 아니다. 디지털 매거진이다. 창간호 특집에서는 <하디스>의 종말론을 환기시켰다. 예언자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와 오늘의 중동 상황을 거듭 비교한다. 당시도 20세기 못지않은 혼란과 분란의 시기, 이슬람판 '전국 시대'였다.
마호메트의 히쥬라(성천)와 지하드(성전)를 따라서 이슬람적 평화가 달성되었던 것처럼, IS와 더불어 태평성세를 회복하자는 프로파간다이다. 2호의 특집 기획은 구약성서와 코란에 바탕을 둔다. 특히 노아의 방주를 강조했다. IS로의 이주야말로 대홍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웅변한다. 4호는 역사 특집이다. 십자군의 실패를 복기했다. 중세 십자군의 패퇴에 견주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국이 침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올해 7월까지 15호가 발간되었다.
알카에다 또한 자신들만의 미디어가 있었다. 독자적인 온라인 뉴스를 시작한 것이 2005년이다. 돌아보니 의미심장하다. 방송의 이름이 <칼리프의 소리(The Voice of the Caliphate)>였다. 10년 사이 칼리프가 재림했고, IS는 더욱 진화했다. 라디오 방송국은 이라크에 있고, 위성 TV 방송국은 리비아에 있다. 24시간 인터넷 방송 채널도 출범시켰다.
일방향의 미디어도 아니다. 분산적이고 쌍방형적이다. 전 세계 지하드 전사들이 개별적으로 미디어 활동을 한다. HD 카메라, 편집 소프트웨어,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하여 최상의 화질로 영상을 제작하고, 세련된 디지털 매거진을 발행한다. 저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하면서, 16억 '아랍어 공론장'에 빛의 속도로 전송, 재전송한다. 페이스북을 차용한 무슬림북(Muslimbook)도 있고, IS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부 이라크를 무대로 지하드 전사가 되어 미군과 싸우는 전쟁 게임이 인기라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들이 가장 크게 호응한다.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가며 디지털을 '모어'로 삼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의 최고수들이다. 범죄 조직과 아동 포르노 유통 등에 활용되는 지하 인터넷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미국의 군사 안보망에 필적하는 방화벽을 갖춘 채 활동한다.
디지털 금융에도 능하다. 자금 또한 온라인으로 입금, 출금, 송금한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능숙하게 활용한다. 도청과 추적을 방지하는 독자적인 시스템도 갖추었다. 오히려 그들을 해킹하는 세력들을 역추적하기 위한 위장 사이트도 만들어 놓았다. 그 덫에 접속하는 순간 적들의 IP 주소가 드러난다. 그 경로를 통해 해킹하여 상대편의 사이트를 다운시키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수들의 전략이다. 계속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도록 '관리'할 뿐이다.
IS는 디지털에 기초해 등장한 최초의 국가이다. 지하드 전사들의 모집과 채용부터 선전 선동, 나아가 전장에서의 전술 전략 입안까지 디지털에 의존한다. 아니 국가 건설까지도 온라인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계와 실재계를 오고가며 현실을 증폭시키고 증강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단기간에 대규모 군대를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무력에 기반을 둔 영토 지배 또한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디지털 칼리프가 인쇄술에 기반을 둔 '상상의 공동체', 20세기형 국민 국가를 내파시킨 것이다.
IS와 세계를 잇는 온라인 연결망은 아랍어가 대세이다. 그러나 영어의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랍어 공론장에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는 신속하게 영어 자막이 깔려 재유통된다. 사이버 공동체 특유의 협동과 공유 정신이 가동되는 것이다. 러시아어, 우르드어, 중국어 자막도 생겨나고 있다. 즉, IS 네트워크는 문자 그대로 '글로벌'하다. 국민 국가(Nation-State)가 아니라 지구 국가(Global-State)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 시민'을 자처한다. 어느새 '움마'에 근접해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핫하고 쿨하며 힙하다고 여긴다. 진지할 뿐 아니라 근사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미디어들은 폄하하기 일쑤이다. 먹고살기 힘든 루저들의 비행과 탈선으로 간주한다. 청소년 문제쯤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빈곤 타개를 위해서, 빚에 쪼들려서 이주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결국 IS에서의 생활을 견지지 못하고 재탈출을 감행하여 구미의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일부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는 뜻하는 바 있어 참여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미군과 맞서서 싸우는데 돈 때문에 달려갈 수가 있을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인 용병들과도 다르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미군을 지원하는 일이었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물질적 유혹보다는 정신적 감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용병보다는 의용병이 더 어울린다. 자신들의 이주를 히쥬라(هِجْرَة), 성천(聖遷)에 빗대는 것이다.
이슬람력의 '원년'은 서력으로 622년이다. 마호메트가 태어난 해도 아니고, 예언의 계시가 시작된 해도 아니다. 탄생도 말씀도 원년으로 기리지 않는다. 622년이 '원년'인 까닭은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해이기 때문이다. 다신교 신자들의 적대와 적의에 둘러싸인 메카에서 탈출하여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성천'으로 기리는 것이다. 바로 그해로부터 찬란한 이슬람문명이 비롯되었다고 여긴다. 메디나로 이주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이슬람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630년 메카를 재탈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재탈환을 완성했던 630년보다 대이주를 감행했던 622년을 더 높이 치는 것이다.
IS에 집결한 사람들 역시도 622년을 환기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제2의 히쥬라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을 선포한 2014년에만 세계 80개국, 1만5000명이 결집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다국적군'이나 '연합군'으로 부르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어디까지나 무슬림 공동체로서 하나일 뿐이다. 즉 IS는 '국민'으로 구성되지 않은 복합 국가이며 미니 제국이다. 태생부터 철두철미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 탈근대주의다.
CNN과 BBC에서는 IS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인터뷰만 나온다. 그러나 알자리라 아랍어 방송이나 IS와 소통하는 아랍어 공론장에서는 IS로 진출한 이들의 인터뷰를 접할 수도 있다.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이란과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나 이라크의 모술까지 이르렀던 한 무슬림 여전사의 인터뷰였다.
2014년 당시 25살이었다. 2001년 12살이었다는 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12살 소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부모와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조리 죽었다. 마을 공동체가 일시에 사라졌다. 고향은 폐허가 되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에게 IS는 한줄기 빛이었다. 죽을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모술까지 이른 것이다.
나는 습관처럼 기존의 국경선을 지운 유라시아 전도를 펼쳐놓고 그녀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았다. 어마어마한 거리다. 고산과 사막이 이어지는 험지이기도 하다. 재차 20세기의 대장정이 연상되었다. 상하이에서 출범했던 중국공산당이 연안까지 퇴각했던 거리와 얼추 비슷하다. 연안에는 중국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다. 조선인도 있었고, 베트남인도 있었고, 몽골인도 있었다. 타이인, 인도네시아인도 있었다. 동아시아 좌파들의 해방구였다. 얼핏 스페인 내전도 떠올랐다. '사회주의 국제주의'에 헌신하는 유럽 좌파들도 군사 파시즘에 맞서 스페인으로 달려갔던 시절이 있었다.
중국의 대장정과 스페인 내전을 빗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보파'들의 편견을 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들 또한 그들처럼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을 위하여 IS에 지원병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어쩌면 이 불의한 세계를 타도하겠다는 목적의식만큼은 동일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 극복의 경로와 방편이 다를 뿐이다. 저들은 어디까지나 1400년 이슬람 문명사의 지평에서 20세기를 회고하고 21세기를 열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독자적인 논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해석도 공감도 되지가 않는다. 억측만 난무하고 오해만 쌓일 뿐이다. 열린 사고가 절실하다.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성의 주박에 결박되지 않는, '정치적 올바름'에 포박되지 않는, 사상해방이 긴요하다.
Arab Spring : 문명 해방 운동
'아랍의 봄' 직후 개별 국가에서 정치 참여의 공간이 대폭 확장되었다. 그곳에서 약진한 것은 이슬람주의 온건파였다. 무슬림형제단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슬람식 개혁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통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했다. 곧장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했다.
'세속주의'의 보루, 군부가 대표적이다. 이집트부터 (재차)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청년들은 깊이 좌절했다. 민주주로의 이행과 제도 내 개혁에 대한 회의가 더욱 깊어졌다. '일국 이슬람주의'는 '일국 사회주의'처럼 애초 어울리지 않는다는 각성이 일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에 빌붙어 이슬람법을 곡해하는 어용학자(울라마)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폭발했다.
그들에게 칼리프의 복원을 제창하는 IS는 매혹적인 선택일 수 있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뜻밖의 출로가 열린 것이다. 튀니지에서, 이집트에서,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IS로 향했던 이유이다. 본디 튀니지인, 이집트인, 요르단인, 사우디인, 예멘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슬람적 보편을 구현했던 오스만제국에서는 오로지 무슬림이 있었을 뿐이다. 알라 아래 하나였다.
그들은 더 이상 20세기형 민족 해방 운동에 투신하지 않는다. 국민이기를 거부한다. 국민 국가에 적응함으로써 독재자들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그들이 '움마'(이슬람 공동체)를 해체하고 개별적 국민으로 동원함으로써 이슬람의 회복이라는 지하드를 방치하고 억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의 식민주의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적 정체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건국(建國)'이었지 '복국(復國)'은 아니었다.
아니, 국가 간 체제라는 외래의 시스템이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이교도의 지배'가 연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간 체제에 의탁하여 독재를 지속하는 자국의 지배 세력에 대해서도 지하드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이다. 국가가 지하드를 수행하지 않노라면, 이제는 그 국가에 맞서서라도 지하드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로막는 기성의 근대 국가야말로 척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미국이 멀리 있는 적이라면, 중동의 국가들은 가까이 있는 적이다. 민족 해방 운동 이후의 '문명 해방 운동'의 출현이다. 그것이 진정한 '아랍의 분출(Arab Spring)'에 가까울 것이다. 그 솟구치는 역사의 물결을 타고 오름으로써 IS 또한 삽시간에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IS를 '국제 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정곡을 찌른 표현이다. 그들은 20세기형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 구미식 세계 질서에 도전하여 이슬람 세계 질서의 복원과 갱신을 희구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을 아울렀던 오스만제국을 30여 개 국민 국가로 분열시켜 지배했던 20세기의 영국과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동 대혼란의 근저에 구미(歐美)가 자리한다. 영미가 이식한 근대적 국제 질서야말로 화근인 것이다. IS는 그 100년의 대혼란을 청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올바른 방책이 아닐 수 있다. 최선의 해법이 아닐지 모른다. 아니,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것 또한 묘안은 아닐 것이다. 어디까지나 봉합에 그친다. 서아시아의 대분열 체제를 지속시키는 하책에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은 봉합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영국은 더 이상 19세기의 대영제국이 아니다. 미국도 이제는 20세기의 대미제국이 아니다. 분할 통치를 통하여 억누를 수 있었던 완력이 완연하게 약해졌다. 결국은 탈이슬람화의 20세기를 거슬러 재이슬람화의 21세기로 반전되어갈 공산이 훨씬 크다. 즉 아랍에서 되튀어 오르고(spring)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이슬람 문명이지, 서구화도 민주화도 아니다.
그럴수록 이슬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공부해가지 않을 수 없다. 1400년 이슬람 문명사의 지평에서 2016년을 독해해야 한다. 아니 올해는 그들에게 "1437년"이다. 현재를 1437년으로 헤아리는 시간 감각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역사 없는 시사가, 사론 없는 이론이 거듭된 오인과 오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첫 실마리로 이슬람의 고유한 세계 질서인 '이슬람의 집'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본다. 설령 IS가 아닐지언정, 그들은 종내 딴집살이를 마감하고 '이슬람의 집'으로 귀의할 것 같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견문] 이슬람의 집 : 실향과 귀향
이슬람 천년 제국, 부활의 날갯짓
이슬람 : 유라시아의 대동맥
카이로에 떨어진 것은 한낮이었다. 북아프리카를 달구는 람세스의 태양이 작열했다. 인프라가 열악하다. 공항 철도는 없고, 공항 버스도 드물다. 10인승 승합차에 20명을 태우고 버스라고 한다. 가뜩이나 이스탄불에서 조기 철수한 처지에 심란함이 더해졌다. 택시를 타기로 했다. 어딘들 외국인은 봉이다. 바가지를 옴팡 씌우기 마련이다.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흥정에 임했다. 역시나 내가 알고 있던 가격의 서너 배를 부른다. 들은 척도 안하고 지나쳐 버렸다. 나의 단호함에 마침내 한 기사가 정가를 제시한다. 의기양양 그의 택시로 향했다.
내가 졌다. 택시 뒷자리에는 이미 딴 손님이 타고 있었다. 강제 합승을 당한 것이다. 짜증이 솟았지만, 정수리에 내리 꽂히는 햇살이 너무도 뜨거웠다. 원점으로 되돌아가 전투를 재개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 불만을 표출하기도 전에 내 여행 가방은 이미 트렁크에 실린 상태였다. 결국 앞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사의 표정이 득의만만했다.
택시는 낡디 낡은 고물이었다. 20년은 더 굴렸지 싶다. 수동 기어를 바꿀 때마다 변속의 진동이 고스란히 몸으로 전해지는 승차감을 보유했다. 에어컨도 틀지 않는다.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 좀 틀어 달라 해도 'one minute'만 10분째 반복한다. 택시 기사는 영어를 말하지 못했고, 내가 익힌 아랍어는 소용이 없었다. 문어(현대 표준 아랍어)와 구어(각 나라의 일상어)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집트의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랍어는 딴 나라 말이었다.
내가 어설픈 아랍어로 꿍얼거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가 참견을 시작했다. 이집트 택시는 원래 에어컨을 켜지 않는단다. 창문을 열고 배기가스와 모래 먼지로 한껏 오염된 공기를 바람으로 맞으며 달리는 것이 통상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어와 표준 아랍어 모두를 능통하게 구사했다. 그제야 처음으로 백미러를 통해 얼굴을 확인했다. 20대 후반 남짓의 아시아인이다. 덥수룩한 수염이 덜한 것만으로도 친근감이 전해졌다. 비로소 통성명을 나누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했다. 동북아의 한국인과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인이 북아프리카의 카이로에서 한 택시를 탄 것이다.
인도네시아라면 나도 작년(2015년)에 갔던 곳이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둘러보았다. 글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몇몇 유적지도 탐방했다. 견문 2년차, 왕왕 이런 경우가 생긴다. 두바이에서 만난 택시 기사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었다. 영어와 아랍어를 8:2의 비율로 섞어 다카와 치타공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이 친구의 고향은 자카르타라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반둥 회의 60주년 기념행사와 조코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어째 반응이 시쿤둥하다. 반둥 회의로 말미암아 출범했던 아시아-아프리카 작가 회의 본부가 카이로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그 아-아 작가 회의가 수여하는 로터스 상을 김지하가 받았다는 일화 또한 머릿속으로만 아랍어로 작문해 보았다.
대신 그가 한껏 목소리를 높인 것은 'Lee Min Ho'였다.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챙겨본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이민호가 최고란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멋있다는 것이다. 한참을 드라마로 얘기꽃을 피웠다. 북아프리카에서도 한류 덕을 본 것이다. 나의 이메일과 그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카이로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란다. 우리는 아시아인이니까 이집트인이 해코지 하면 돕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인이니까',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었다. 100년 전 쑨원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소식에 '아시아인'으로서 아랍인과 함께 벅찬 감동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 이집트였다. 쑨원이 통과했던 수에즈 운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면서 무슬림이기도 했다. 마지막 인사는 '인샬라'였다. 신의 가호를 빌어준 것이다. '슈크란', 나도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유학생이기도 했다. 카이로의 한 작은 대학에서 이슬람 신학을 전공하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단다. 그러나 공부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비즈니스의 방편이었다.
카이로는 20세기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탈이슬람화로 탈주하는 터키의 이스탄불을 대신하여 수많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카이로에 모여들었다. 그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 친구는 그 저비용의 유학 비자를 얻어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나와 조우한 날도 두바이에서 잔뜩 물건을 사서 카이로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2주 후에는 자카르타에 다녀온다고도 했다. 북아프리카의 카이로, 중동의 두바이, 동남아시아의 자카르타를 주유하는 항공 무역상쯤 되는 것이다. 16억 아랍어 공론장, 이슬람 세계의 연결망을 십분 활용하고 있었다.
비단 21세기 세계화의 소산만은 아닐 것이다. 14세기 북아프리카의 서쪽 끝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바까지 이르렀던 이가 이븐 바투타였다. 중동에 있는 쇼핑의 천국 두바이에는 '이븐 바투타 몰'이 있다. 바투타가 여행했던 장소를 배경으로 쇼핑몰을 꾸며두었다. 튀니지관, 이집트관, 안달루시아관, 페르시아관, 인도관, 중국관 등 다양하다.
'중국의 무슬림' 정화가 대원정을 했던 함선도 재현해두었다. 그 쇼핑몰의 콘셉트가 '천 년의 지식을 재발견하다'였다. 그 문구를 보고는 잠시 황망했다. 내가 유라시아 견문에 나선 취지를 이미 쇼핑몰에서 구현하고 있던 것이다. 본디 무슬림들의 시공간 감각이 그토록 장쾌했다고 하겠다. 알라 아래 민족, 국가, 언어에 구애받지 않았다.
더 중요하게는 그 폭넓은 이슬람 연결망이 이슬람권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 중화 세계와, 유라시아의 서쪽 끝 유럽 세계를 이슬람 연결망이 이어주었다. 원격지간, 이문화 세계 간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로서 독특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발달시켜온 것이다.
이슬람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로소 유라시아는 동서남북으로 환류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유럽의 남부가, 아프리카의 북부가, 중국의 서쪽이, 인도의 북쪽이, 러시아의 남쪽이 이슬람으로 연결되었다. 유라시아와 인도양을 하나로 아우르는 개방적 세계 질서의 대동맥 역할을 한 것이다.
카이로에서 유학생 비자로 하늘길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친구야말로 아프리카의 무슬림 이븐 바투타와 아시아의 무슬림 정화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택시에서 내린 곳은 60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여 산다는 '리틀 자카르타'였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이븐 바투타 몰. ⓒ이병한
'이슬람의 집'
오늘날 자카르타와 카이로는 국가로 나뉜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고,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다. 인도네시아도 이집트도 20세기의 산물이다. 서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도네시아를 창출했고, 오스만제국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이집트가 생겨났다. 국적을 표시하는 여권이 없으면 두 도시를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슬람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슬람 공동체, 움마(أمة)의 흔적은 남아있다. '이슬람의 집'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국가도 민족도 인종도 언어도 부차적이었던 시절이 오래 있었다. 무슬림으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던 시간이 천 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슬람판 '天下一家(천하일가)'였다.
그 이슬람 세계 질서가 체계화된 것이 9세기 초반이다. 아라비아반도의 대정복을 통하여 통일 제국이 등장한다. 동유라시아에서 대당제국이 군림하고 있을 때, 서유라시아에는 아바스제국이 들어섰다. 기왕의 부족 의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대일통을 이루었다. 그 아바스제국을 달성할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슬람이었다.
이슬람의 본디 뜻은 '귀의하다'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를 따라서 알라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이다. 대당제국이 위-촉-오가 다투고 한족과 비한족이 남북으로 갈렸던 시기를 지나서 '唐人(당인)'으로 호/한(胡漢) 융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아바스제국은 무슬림으로서 대융합을 달성하여 '아랍인'을 창출해낸 것이다.
'이슬람의 집(다르 알 이슬람)'이란 만인이 이슬람법에 귀의하는 평천하의 공간이었다. 그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와 언어로 나뉘어 분란을 지속하는 이교도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른바 '전쟁의 집(다르 알 하르브)'이다. 무슬림이라면 그 '전쟁의 집'을 '이슬람의 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이 소위 '지하드'이다. 흔히 성전(聖戰)이라고 번역한다. 꼭 들어맞는 역어는 아니다. 무력에 의한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리의 보급에 있다. 다툼(武)을 그치고 조화(文)에 이르는 것, 부족의 전사들을 이슬람 율법으로 귀의시키는 것, 동사로서의 '文化(문화)'가 곧 지하드였다. 그 지하드를 통하여 '전쟁의 집'이 사라진 이슬람 천하무외(天下無外)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지도자 칼리프의 천명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의 '국제 관계' 또한 이슬람의 집과 전쟁의 집 사이에서 생겨난다. 이슬람의 집이 보편 제국의 실현이라면, 전쟁의 집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한다. 하나의 제국과 여러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정치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민족이나 인종이 아니라 종교였다. 종교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기본축이다. 즉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가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나 무슬림과 이교도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도리어 탄력적이고 포용적일 수 있었다. 코란이냐, 칼이냐는 유라시아 극서 지방에서 살고 있던 주변인(유럽인)들의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다. 이슬람의 국제법으로 '시야르'가 있다. 지하드의 중단을 인정하는 '현실주의 이론'이다. 그 중지 상태를 '수르프'라고 한다. 한문으로 옮기면 '화평'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 무슬림 공동체(이슬람의 집)와 이교도 공동체(전쟁의 집) 사이에 계약으로 성사되는 것이 수르프이다. 평천하에 이르는 중간 단계쯤 되겠다.
이 '이슬람 조공 체제'가 작동하면 이슬람의 집과 전쟁의 집 사이에도 왕래가 가능해진다. 화/이 간의 교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집 안에서 사는 이교도에게도 안전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도, 기독교도도 큰 제약 없이 '이슬람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다. 아니 종교적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기독교 세계에서 박해받는 이들이 '이슬람의 집'으로 망명해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대인이 대표적이다. 평화와 번영의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이슬람의 집'에 의탁하는 삶이 훨씬 더 윤택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점차 많아졌다. 이슬람이 가장 늦게 등장한 유일신 계시 종교였음에도, 가장 넓은 영역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유교가 한족만의 사상이 아니라 몽골족과 만주족, 조선인과 월남인을 막론하고 중화 문명의 보편 이론으로 기능했던 것처럼, 이슬람 또한 아랍인의 민족 종교로 그치지 않았다. '이슬람의 집'에 귀의하는 만인만족에게 열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대한 역할을 한 족군이 바로 투르크(돌궐)이다.
중앙유라시아를 동서로 왕래하던 유목민들이 이슬람에 귀의함으로써 '이슬람의 집'은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게 된다. 중국의 서쪽이 '이슬람 중국'이 된 것도, 인도의 북쪽이 '이슬람 인도'가 된 것도 투르크의 공헌이었다. 투르크와 접속함으로써 이슬람은 세계 종교가 된 것이다. 그들이 일군 600년 최장수 제국이 바로 오스만제국이다.
오스만제국 : 지고의 국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말이 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싶다. 오스만제국을 투르크족의 나라로 둔갑시키는 명명이다. 기원은 유럽의 '터키학'에 있다. 오스만제국의 비투르크계 민족들을 갈라 치는 수법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터키공화국 또한 '오스만 투르크'라는 말을 받아썼다는 점이다. 제국사를 민족사로 미화함으로써 터키공화국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도착된 민족주의의 발로였다.
그러나 오스만제국은 전연 일개 민족의 나라가 아니었다. 지배 계급조차 투르크족이라는 의식이 극히 희박했다.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라는 수사도 적당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이슬람 세계 제국'이었다.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고(至高)의 국가'라고 칭송했다.
허언만도 아니었다. '지고의 국가'는 이슬람 세계만 통합했던 것이 아니다. 이스탄불은 비잔틴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다. 비잔틴은 기독교 제국이었다.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간주했다. 비잔틴제국의 문명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였다. 키릴 문자권이었다. 오스만제국은 그 키릴 문자권과 아랍어 문자권을 통합시킨 것이다. 동로마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대일통을 달성했다. 그래서 로마제국의 후계자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그리스 정교, 아르메니아 교회, 유대교와 기독교 등이 공존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양대 세계를 통합한 '지고의 국가'에서 민족이란 정체성은 촌스러운 것이었다. 으뜸이 종교요, 다음이 직업이었다. 종교망과 직업망이 남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를 겹겹으로 촘촘하게 망라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상업에서 발군이었다. 동쪽으로는 아나톨리아와 이란에 이르는 육지 교역로에 두루 분포했다. 서쪽으로는 유럽의 여러 도시에 집거촌를 꾸렸다. 이 동서 아르메니아인 연결망이 합류하는 곳이 바로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었다. 서유라시아 물산의 집결지였던 것이다. 이스탄불부터 마드리드까지 이어졌던 지중해 연결망에서는 유태인이 활발했다.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해운 연결망에는 그리스 정교도가 발군이었다.
그런데도 역시나 최대 광역대의 연결망은 무슬림 네트워크였다. 북아프리카의 최서단부터 동유라시아의 서남중국까지 이어졌다. 육로로는 이란 고원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중국으로, 해로로는 페르시아 만과 홍해, 아라비아 해와 벵골 만을 지나 남중국과 접속했다. 상인과 물자만이 오고갔던 것이 아니다. 서남중국과 동남아에서도 메카와 메디나로 향하는 순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말라카와 메카가 접속된 것이다. 학자들과 문인, 관료들을 통한 지식과 문화의 범유라시아적 교류 또한 활발해졌다. 서유라시아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스탄불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오스만제국에는 '국어'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행정어로는 투르크어가 기능했고, 학문과 종교의 언어로는 아랍어가 존경받았으며, 문학과 예술의 언어로는 페르시아어가 꽃을 피웠다. 이란의 사파비아 제국과 인도의 무굴제국, 중앙아시아 소국과는 페르시아어로 소통하고, 아라비아반도와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아랍어로 교류했다. 유럽과의 의사소통은 주로 그리스어를 활용했다.
그리스 정교회의 총주교가 이스탄불에서 살았다. 그래서 오스만제국과 유럽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관직도 그리스 정교회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다언어 연결망을 통하여 유럽부터 중국에 이르는 범유라시아의 지식과 정보가 이스탄불에 집약되었던 것이다. 가히 창조 경제, 문화 융성의 본거지였다.
그만큼이나 제국의 상층부터 풀뿌리 생활 현장까지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상황이 항상적이었다. 혼재와 혼성과 혼종이 일상적이었다. 공존공생의 지혜를 반천 년이 넘도록 축적해온 것이다. 그러했기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발칸반도가 노정하는 그 다양한 종교와 종파의 박물관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풍요로운 다문명, 다민족이 비극의 씨앗으로 전화한 것이 바로 20세기이다. '지고의 국가'가 사라지고 '중동(Middle East)'으로 재편되면서 지상 최대의 화약고가 되고 말았다.
바벨탑 : 서구의 충격
유럽과 이웃했던 오스만제국에서는 '서구의 충격'이 청천벽력은 아니었다. 마치 암세포의 전이처럼 점진적으로 잠식되었다. 한때는 유럽의 계몽주의와 세속화를 '오스만화'라고 이해한 시절도 있었다. 더 이상 종교에 연연하지 않는 유럽의 근대화야말로 '오스만화'로 여긴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 고전부터 과학과 수학까지 이스탄불과 바그다드, 카이로에 있던 도서관들에서 유럽으로 전수해준 것이다. 르네상스의 배후가 오스만이었다. 이탈리아의 소도시에 살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수 있었던 것 또한 지척의 보편 제국 오스만의 술탄을 참고했음에 분명하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장 번다하게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었다.
다만 30년 종교 전쟁 이후에도 '유럽 내전 체제'는 지속되었다. 1945년까지 장장 300년을 '전쟁의 집'에서 살았다. 말미암아 군사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해갔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유럽과 오스만의 군사력이 역전된다. 싸움박질 만큼은 오스만을 능가한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 파견된 오스만 관료들을 통하여 유럽의 군사 기술을 수용하는 개혁 정책을 단행한다. 오스만판 '양무(洋務) 운동'이었다.
1856년 크림 전쟁 종결 이후에 열린 파리 회의에는 오스만제국의 대표 또한 참석했으니, '서구 열강'의 일원으로 대접받은 것이다. 동시대 세포이의 항쟁으로 붕괴된 무굴 제국이나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원명원이 불탔던 대청제국에 견주어, '서구의 충격'이 한층 덜했던 것이다. 그래서 1924년까지 가장 오래 버텨낼 수 있었다.
오스만을 붕괴시킨 충격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서 왔다.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같은 신사조의 문헌이야말로 오스만제국을 침식시키고 내파시켰다. 유럽과의 의사 소통을 담당하던 그리스 정교도들부터 분화가 일어났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서구에서 유행하는 민족주의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젖어 들었다. 그리스의 독립을 요구했다. 그 다음은 발칸 반도였다. 구교도 신교도 오스만제국을 이교도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종교가 같은 아랍에서도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되어갔다. 이슬람은 본디 아랍인의 종교이거늘, 오스만제국은 투르크족이 지배하는 이민족 왕조라는 '민족적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저마다 평등과 주권과 독립을, '민족자결'을 요구했다.
'이슬람의 집'의 관점에서 보자면 19세기 중반 이후 민족주의의 침투는 '재부족화'에 다름 아니었다. 탈부족화를 선구적으로 선취했던 보편 문명을 거두고 종교와 민족이라는 특수주의로 퇴행하는 꼴이었다. 오스만제국은 '오스만주의'로 대처했다. 오스만제국 내부의 모든 이들을 '오스만인'으로 '평등'하게 대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슬람 제국에서 다민족 국가로 이행하는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패착이었다. '오스만주의'의 출현으로 제국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슬람의 집'에서 구가했던 다양성을 지우는 '국민 만들기'로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곳곳에 근대식 학교를 세워 '오스만어'라는 신종 표준어를 강제해 갔다. 도처에서 오스만제국에 맞선 독립전쟁과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가장 큰 역설은 투르크족 역시도 투르크 민족주의에 감화되어갔다는 점이다. 이른바 '청년 투르크'의 등장이다. 터키판 신청년들이었다. 투르크어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등을 고루 대접하던 오스만제국에 반기를 들었다. 오로지 투르크어만을 전용으로 삼는 출판과 언론 활동에 매진했다. '국어 순화 운동'에 나선 것이다.
국사 또한 새로이 쓰였다. 나와 남의 투쟁으로 접근했다. 심지어 이슬람을 탄생시킨 아랍족도 적대했다. 졸지에 오스만제국은 '동양적 전제 국가'로 전락했으며, 민족 의식을 결여한 칼리프 또한 '전제 군주'라고 성토했다. 술탄의 '독재'에 맞서 청년 투르크가 표방한 것이 공화정이다. 세속적인 근대국가, 터키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청년의 기수 케말 파샤였다. 터키의 국부가 된다.
터키의 등장을 동시대 중국에 빗대자면 대청제국을 붕괴시키고 '한족 공화국'을 세운 것이 된다. 오스만 지배자들이 최후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오스만인'이란 쑨원의 '중화민족'에 근접하는 개념이었을 것이다. 동유라시아에서 대청제국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진화해갔던 바로 그 시점에, 오스만제국은 끝내 '오스만 민족'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30여 개 국가로 분열되어간 것이다. 주권과 평등, 독립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항상적인 전시 체제, 서아시아 대분열 체제로 진입한 것이다.
1000년 이슬람의 집을 100년 화약고로 전락시킨 '바벨탑의 저주'였다. 어느새 무슬림들이야말로 '전쟁의 집'에 살게 된 것이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이병한
움마 : 글로벌 디아스포라
반둥 회의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모스크에서 열린 별도의 회합을 구경한 적이 있다. 이슬람 국가들만 따로 모여 가진 행사이다. 주역 또한 국가 수반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즉 이슬람학자들인 울라마였다.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어는 물론이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도 까막눈에 귀머거리였다. 간간이 들려오던 '팔레스타인'만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차원에서 발현된 '국제주의'로만 이해했다. 제3세계 신생 국가 간의 연대 의식의 표출이라고 접수했던 것이다.
이슬람 문명사 공부를 계속하노라니 이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은 일종의 은유이고 상징이다. 구미적 근대 세계로 말미암아 '이슬람의 집'을 상실한 움마의 실향민 정서를 대변하는 기호이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이란에서도, 터키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거듭 '팔레스타인'이 환기되는 것이다.
즉, 20세기 이래 움마는 글로벌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그들이 살아가던 집이 무너졌다. 고향을 상실했다. 뿌리가 뽑혔다. 안락감과 편안함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대의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또한 사라졌다. 그들을 무슬림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규정짓고 국민으로 동원하는 세속 국가가 들어섰다.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지언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위는 주지 못했던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배자였지 지도자는 아니었다. 권위가 없는 권력이었기에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동의 숱한 신생 국가에서 정국 혼란과 억압적인 통치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이라고 하겠다. 기층과 상층 간에, 토착 민중과 외래화된 엘리트 간에 거대한 균열과 단절이 자리한다. 이슬람권에서도 역력한 고/금 간의 분단 체제이다.
하기에 '아랍의 봄'의 귀결로 칼리프의 재림을 선언하는 정치체(IS)가 들어섰음을 도무지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이다. '지고의 국가'가 사라진지 100여 년 만에 재차 칼리프가 아랍어 공론장에서 회자되고 있다. 동시대의 움마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어지럽고 정의롭지 못한 세계에 다시 착근하기 위한 몸부림과 용틀임이 시작된 것이다. 무슬림이 무슬림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세계 질서를 (재)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또한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칼리프의 탑'이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투쟁 또한 민족 해방 운동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외부 세력이 이식한 외삽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다. 근본적 차원에서, 근원적 지평에서, '이슬람의 집'의 재건해 가는 운동이다. 실향 이후의 귀향 운동이며, '전쟁의 집'에서 탈출하는 문명 해방 운동이다. 제2의 히즈라, 성천(聖遷)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집'이 해체되어가며 빚어진 가장 큰 역설로 투르크 민족주의의 등장을 꼽았다. 앙카라를 근거지로 삼은 터키공화국이 이스탄불에 맞서 '독립 전쟁'을 펼침으로써 저물어가는 제국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바로 그 터키에서도 새천년의 개막과 함께 등장한 정치 사조가 '신오스만주의'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슬람의 집'을 부수고 박차고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출가 이후, 혹은 가출 이후의 귀로에 접어든 것이다.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다. 집권 이래 재이슬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써 10년 넘게 권좌를 지키고 있을 만큼 기층의 지지 또한 탄탄하다. 때문에 올여름 이스탄불에서 목도했던 한편의 정치 활극 또한 '민주 대 독재'라는 얕은 도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 문명사 1400년, 투르크의 이슬람 수용사 1000년, 오스만 제국사 600년, 터키공화국 100년이라는 겹겹의 시간대에서 중층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탈이슬람화와 재이슬람화의 길항으로 터키의 20세기를 회고해본다. 새삼 이슬람의 뜻이 '귀의하다'임을 곱씹으며 음미하고 있는 '1437년'의 10월이다.
[유라시아 견문] 터키 행진곡 : 100년의 고투
터키, '박정희' 대신 '누르시'를 선택하다
오르한 파묵 : 동과 서
이스탄불에서는 베이오울루(Beyoğlu)에서 지냈다. 살았다고는 못하겠다. 겨우 두 달을 조금 넘겼다. 살려고 했었다. 살아보고 싶었다. 帝都(제도)였던 곳이다. 여러 제국의 수도였다. 이름도 여럿이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차례로 거쳤다. 겹겹의 문명이 켜켜이 쌓인 남다른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베이오울루에 터를 잡은 것은 순전히 오르한 파묵 때문이었다. 학창 시절 그의 작품에 흠뻑 빠졌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펴냄)보다 <내 이름은 빨강>(이난아 옮김, 민음사 펴냄)을 더 높이 쳤다. 부러 파묵이 사는 동네에 집을 구한 것이다. 그의 소설 제목을 따서 만든 '순수의 박물관(Masumiyet Müzesi)'까지 5분 남짓 거리였다. 파묵은 '이스탄불의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스탄불>이라는 회고집도 발간했을 뿐더러, 거개의 작품이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토박이라고 여겼다.
아침마다 박물관이 내다보이는 맞은편 2층 카페에서 글을 썼다. 오가는 길에 박물관을 둘러보는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었다. 관람객의 7할이 유럽인이다. 2할은 아시아인이다. 터키인과 중동인은 뜨문뜨문하다. 터키에 문학 애호가가 드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아랍 문학과 페르시아 문학의 찬란한 전통이 이스탄불로 흘러들었다.
지금도 시인과 소설가의 낭독회가 열리는 북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어쩐지 세계적인 작가임에도 '국민 작가'는 아닌 듯 했다. 민족 문학보다는 세계 문학 쪽이었다. 그래서 터키는 끝내 브뤼셀(EU)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파묵만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을 거머쥘 수 있었다. 2006년이었다.
그 안과 밖의 온도차를 예민하게 의식하며, 파묵의 작품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소싯적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기 시작한다. <내 이름은 빨강>부터 동과 서의 구도가 확연하다. 때는 16세기 말, 오스만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특별 도서를 만들고자 한다. 그 작업을 위임받은 공방의 감독관은 베네치아의 원근법을 활용하여 세밀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 서양의 기법을 도입하려는 예술가의 초상이다.
그와 대척점에 놓인 인물이 이슬람 설교사이다. 원근법의 모방을 반대하는 보수파로 묘사된다. 갈등 끝에 화가가 암살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슬람이 수구의 아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근대와 비서구의 전근대라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도식이 복제되고 있었다. 다만 그 진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공들인 추리 로맨스의 서사만큼은 가히 노벨상 작가에 값한다고 하겠다. 재독임에도 재미만큼은 대단했다.
원근법은 서구 근대의 산물이 아니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원근법이 존재했다. 그리스인부터 이미 원근법을 알았다. 다만 이데아를 궁리하는 플라톤은 사물의 정확한 크기를 오인시키는 원근법에 비판적이었다. 광학을 탐구한 이로는 유클리드도 있다. 같은 물체가 거리에 따라 다른 크기로 보이는 시각 현상을 연구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학으로 그쳤을 뿐이다. 그 광학을 활용하여 화폭 위에 재현하지는 않았다. 그리스 예술의 본령은 회화가 아니라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16세기 동아시아의 산수화는 어떠했나. 늘 거리감을 표현했다. 아니 당시 오스만 회화를 열람해보아도 원근감은 구현되고 있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세이드 로쿠만이 있다. <톱카프 궁전도>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이 그림에서도 입체감을 구현한다. 혹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오스만제국은 '지고의 국가'였다. 비잔틴 세계의 중심 콘스탄티노플과 이슬람 세계의 중심 메카를 모두 거느리며 삼대륙을 통합한 세계 문명의 정점이었다. 베네치아는 이스탄불에 견주면 어촌이고 깡촌이었다. 실제로 <톱카프 궁전도> 또한 르네상스기의 소실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소실점으로의 수렴 없이도 원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아니 유클리드의 광학이야말로 이스탄불에서 베네치아로 흘러갔다. 유클리드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인물이 이븐 알 하삼이다. 과학과 예술을 망라한 '르네상스 지식인'이었다. 11세기의 인물이었으니 원조라고 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세기 르네상스"라는 말도 쓴다. 즉, 라틴어가 지배하는 가톨릭 세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그리스 고전들을 보존하고 아랍어로 번역하여 계승하던 이들이 무슬림이었다.
지식의 보고였던 바그다드와 카이로와 이스탄불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급의 인물이 수두룩했다. 즉 원근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보했느냐, 정체했느냐는 더더욱 아니었다. 알아도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근법의 채용에서 해방감을 느낄 만큼 갑갑하고 답답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세'라고 불리는 가톨릭 시대는 '신의 눈'이 독점하던 시기였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인간의 눈'을 구현할 수 없는 시대였다. 모든 피조물은 오로지 신의 관점으로 배열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세계관이 지배했다. 그 기도하는 손을 자르고 그리스의 다원적 세계관을 복구했으니, '르네상스'라고 할만 했다.
다만 유럽의 이웃에 있던 오스만이 보기에는 전혀 특별난 일이 아니었다. '이슬람의 집'에서 그리스 고전을 널리 읽던 그들로서는 르네상스도 종교 개혁도 계몽주의도 죄다 '오스만화'라고 여겼을 뿐이다. 아랍에서 유럽으로 서천(西遷)한 것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 <톱카프 궁전도>. ⓒwikipedia.org
<하얀 성>(이난아 옮김, 민음사 펴냄)이라는 작품도 문제적이다. 여기서는 오스만의 천문학자가 등장한다. 그가 조수로 부리고 있는 이가 이탈리아 학생이다. 베네치아에서 나폴리로 가다가 해적에게 습격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온 것이다. 그런데도 다방면의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 오스만의 주인이 되레 유럽의 노예에게 매료된다.
거꾸로 신지식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오스만 궁정의 지배자들에 좌절한다. 도대체 자신은 누구인가, 심각하게 고민한다. '나는 왜 나인가?',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예 학생은 오스만 선생의 고뇌를 따뜻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여러 방식으로 응답해준다. 그가 건너온 유럽에서는 이미 '자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헛웃음이 났다. 기가 막혔다. 문학 작품에다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훈장질하는 것만큼 따분한 짓은 없다. 꼰대 소리 듣기 딱 좋다. 그럼에도 좀체 수긍하기 힘든 서사이다.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중반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 출간된 것이 1637년이다. 파묵이 17세기 중엽의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삼은 것 또한 <방법서설>을 의식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한 권이 나왔다고 해서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 법이다. 기존의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책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외면당하거나 탄압받기 일쑤이다.
게다가 '내면의 발견'이라는 것 자체도 지극히 서구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의 인간도 자기 자신을 사고한다. 다만 그 사고의 지평이 데카르트와는 다른 차원일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회의론이 파격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 지배하는 가톨릭 세계에서 오래오래(1000년) 살았기 때문이다. 원근법(풍경의 발견)도 회의론(내면의 발견)도 어디까지나 유럽의 맥락에서나 의미를 가진다. 구약과 신약을 뛰어넘었다는 코란을 읽고, 모세와 예수의 모자란 점을 채웠다는 마호메트를 따르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애초 필요 자체가 없던 일이다.
그런데도 파묵의 작품에서는 유럽은 종교의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진보한 세계로 등장한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스탄불은 무지몽매하며 후진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철두철미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집필된 소설이다. 그러하기에 저항감 없이 구미 독자에게 술술 읽혔을 것이다.
전혀 불편하지 않은 작품이다. 조금도 불온하지 않다. 재차 그가 터키 출신임을 강조하자. 서구화에 매진하는 '모범적인 이슬람 국가'였다. 나는 몹시 못마땅했다. 대놓고 여쭙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갔다. 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들을 차곡차곡 모아갔다. 그러나 한여름 돌연한 사태로 결국 성사될 수가 없었다.
케말 파샤 : 조국 근대화

▲ 터키의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1936년). ⓒwikipedia.org
파묵 앞에 파샤가 있었다. 터키공화국을 세운 국부이다. 케말 파샤 없이 터키를 말할 수가 없다. 헌데 그의 고향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터키가 아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 되었다. 그가 태어났던 오스만 말기(1881년), 마케도니아는 오스만 내에서도 굴지의 코즈모폴리턴 도시였다.
고도의 관료제가 발달되어 있었기에 인구 통계 또한 정확하게 남아있다. 5만 명의 유대교, 2만6000명의 이슬람교, 1만1000명의 그리스 정교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 유대인 또한 이베리아 반도부터 동유럽 출신까지 다양했을 것이다. 무슬림도 투르크,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등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그리스 정교도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망라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오스만제국은 사람을 민족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슬람의 집'의 밖에서 온 '이교도'들도 7000명이나 있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의 문물 수용에도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인프라 정비 또한 이스탄불에 못지않았다. 전형적인 '오스만적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파샤의 '정치적 인격'을 형성한 곳은 마을이 아니라 학교였다. 마드라사(이슬람 학교)가 아니다. 사관 학교였다. 군대에서 받은 장교 교육이 결정적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전국 시대였다. 유럽에서는 만국이 만국과 다투고, 유럽 밖에서는 만국이 만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다.
파샤는 시대의 본질을 꿰뚫었다. 근대 국가는 군사 국가였다. 전쟁을 군인만 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다. 만인이 군인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곧 '국민'이다. 오스만에서도 신민이 아니라 국민을 창출해야 했다. 국민을 만들고 지도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였다. 더 이상 아랍어로 코란을 읽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어를 익혀 그쪽에서 연구한 이슬람 문명을 학습했다. 마호메트가 히스테리 환자였을 것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연구에 밑줄을 그었다. 독일의 통속적 유물론에도 심취했다. 그가 청년시절 쓴 글들을 읽노라니 박정희의 <국가와 혁명과 나>가 연상되었다. 민족의 노예 근성을 타파하는 터키판 '조국 근대화'를 열렬히 염원했다.
'전쟁의 집' 유럽에서 기어이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다. 이웃 오스만제국도 말려들었다. 칼리프는 지하드를 선언하며 참전했다. '이슬람의 집'으로 개조하려 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때는 '1335년'이 아니라 '1914년'이었다. 유럽의 힘이 절정이었다. 민족주의가 대세였다. 칼리프의 선언에 아랍인부터 (영국의 지원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
오스만의 반대편에 섬으로써 '민족 해방'의 기회를 엿본 것이다. 식민지 인도의 펀자브 무슬림도 영국군에 포함되어 오스만제국에 맞섰다. 무슬림과 무슬림이 대결하는 살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1918년 10월, 결국 오스만제국은 항복한다. 지하드가 실패했다. '이슬람의 집'이 '전쟁의 집'에 패배했다.
마침 미국과 소련에서는 윌슨과 레닌이 경쟁적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옹호했다. 동유라시아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반식민지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분출했다. 신청년이 출현한 것이다. 보조를 맞추어 서유라시아에서도 '청년 투르크'가 기세를 올렸다. 그 기수가 바로 케말 파샤였다.
1920년 4월 앙카라에서 대국민회의를 소집하고 5월에 혁명 정부를 수립한다. 1917년 레닌이 러시아제국의 차르를 내몰고 소련을 출범시킨 것처럼, 파샤 또한 오스만제국을 뒤엎고 터키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스탄불의 칼리프를 향하여 '독립 전쟁'을 선포한다. 시세는 그의 편이었다.
제국에서 국가로, 문명주의에서 민족주의로, 그 유명한 '터키 행진곡'을 배경으로 삼아 1923년 터키공화국이 출범한다. 경쾌한 리듬의 터키 행진곡이 장엄하고 웅숭깊은 아잔을 누른 것이다. 이듬해(1924년) 오스만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무굴제국, 대청제국, 러시아제국에 이은 유라시아형 제국의 최후였다.
'조국 근대화'의 요체는 둘이었다. 세속주의와 민족주의다. 세속화는 이슬람을 겨냥했고, 민족주의는 오스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슬람이 초래한 '원시적 사회'에서 탈피하여 선진적인 유럽 문명으로 이끌고자 했다. 이 역설적인 전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다대했다. 이슬람에는 애초 교회라는 것이 없다. 교황도 없고, 교황청도 없다. 알라와 신도가 직접 만난다. 개신교의 성격을 일찍 이룬 것이다.
그래서 교권에 맞서 국권을 옹호하는 세속의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교황으로부터 군주의 독립이라는, 교회로부터 개인의 독립이라는 세속화가 애당초 생겨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세속화=근대화를 흉내 내노라니 이슬람 자체가 표적이 되고 말았다. 남을 따라한답시고 제 발등을 찍은 꼴이다.
파샤는 마드라사부터 폐쇄시켰다. 이슬람법(샤리아)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던 법정도 폐지시켰다. 민법은 스위스에서, 형법은 이탈리아에서 따왔다. 교육과 사법을 통하여 공적 역할을 수행하던 울라마의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다. 무슬림이 영성을 갈고 닦았던 수행장도 폐쇄했다.
절을 해야 하는 모스크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긴 의자를 배치한 곳까지 생겨났다. 남성들이 쓰던 터번과 여성들이 쓰던 히잡도 벗겼다. 아름다움을 가리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권장되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미스 터키 선발 대회(1929년)이다. 여성 '해방'의 일환이었다. 음주 또한 합법화되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다.
1925년부터는 서력을 채용했고, 1928년부터는 아랍어 대신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일 다섯 차례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 또한 아랍어가 아니라 터키어로 바꾸었다. 금요 예배가 열리는 금요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휴일인 일요일에 쉬기 시작한 것은 1935년이다. 공공 장소에서 '알라는 위대하다'고만 말해도 감옥에 잡혀가는 '압축 근대화'의 시절이었다.
이슬람을 지우면서 채워간 것이 투르크 민족주의였다. 오스만 시절 '투르크인'이라는 말은 촌놈이란 어감의 멸시어였다. 세련된 오스만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 촌뜨기를 지칭했다. 그러나 1000년 전 투르크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이슬람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것처럼, 이제는 유럽 문명을 수용함으로써 서구 문명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투르크의 참여로 서구 문명은 기독교 세계의 협애한 틀을 넘어서 진정한 국제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르크 민족주의의 고취에는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 등 각종 학문이 동원되었다. 1925년 <이슬람과 통치의 원리>가 출간되었다. 1000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져온 이슬람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을 전면 부정한 책이다. 오로지 정신적 종교로서만 이슬람을 규정했다. 성과 속을 분리시킨, 혼백의 분단 체제를 입안한 첫 저서였다.
서구화와 투르크 민족주의를 '조화'시키자는 국책 담론도 입안되었다. 한쪽에서는 투르크족이 본디 백인종에 가깝다는 학설이 등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흉노부터 칭기즈칸까지 유라시아 유목 민족을 죄다 '투르크 사(史)'로 재해석하는 고대사 '빠'도 생겨났다. 반면 비투루크적 요소들은 철저하게 제거되었다. 아나톨리아에서 수백 년을 살았던 그리스 정교도는 추방되었다. 터키어를 모어로 삼는 정교회 신자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그리스로 쫓겨났다. 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족 또한 '터키 공화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학살과 탄압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도 파샤는 의기양양했다. 1930년대 유럽의 정세 변화 또한 그의 편인 듯했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했다. 파샤는 자신과 동급의 인물들이 유럽에서도 약진하고 있다고 여겼다. 1934년 터키 의회는 그에게 '아타튀르크(Atatürk)'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수여한다.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명실상부 國父(국부)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가 숨을 거둔 것은 1938년이다. 그가 선망해마지 않았던 유럽이 재차 '전쟁의 집'으로 빠져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목도하지는 못했다. 마케도니아에도 묻힐 수가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순수한 터키의 땅'이 아니었다.
서방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아타튀르크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이다.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다. 터키는 신속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세계의 편에 섰다. 이로써 나토(NATO)에 가입할 수 있었다. 마침내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따르는 '歐美(구미)'의 일원이 것이다. 소련의 턱 밑에 자리하는 척후병이자 중동 개입의 대리인이 된 것이다. 터키 행진곡이 널리 울려 펴졌다.
사이드 누르시 : <빛의 책>

▲ 사이드 누르시(1877~1960년)의 초상화. ⓒwikipedia.org
아타튀르크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인물이 있었다. 사이드 누르시(Said Nursî)이다. 파샤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1877년) 훨씬 오래 살다 갔다(1960년). 파샤는 1924년 칼리프를 폐지시키고 종교국을 총리 산하의 부처로 만들었다. 수구파의 아성이자 반동파의 소굴이기 십상인 이슬람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울라마를 공무원으로 편입시키는 '근대적인 정교일치' 체제였다. 이 자리의 수장을 맡아달라고 타진한 것이 누르시였다. 오스만 시절부터 이미 명성이 자자한 이슬람 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칼에 거절한다. 누르시는 칼리프 폐지에 결연하게 반대했다. 1400년 이슬람 문명의 기축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대의를 표방하며 터키공화국에 저항한 것이다. 이에 파샤는 '쿠르드족의 반동'이라며 탄압했다. 누르시는 쿠르드 출신이었다. '이슬람의 집'이 사라지자마자 그의 출신 성분이 주홍글씨가 된 것이다. 쿠르드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정책과 이주 정책이 실시되었다. 누르시 또한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누르시가 태어난 곳은 아나톨리아의 동편이다. 역시나 인구 구성이 다채로운 지역이었다. 무슬림이 25만, 아르메니아교가 13만, 기독교가 1만, 동방 정교회가 1만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자랐다. 마드라사에 들어간 것은 9살 때였다. 원체 가학의 바탕이 탄탄했다. 아버지가 정통 이슬람학의 대가였다. 불과 5년 만에 마드라사의 전 과정을 이수해 버린다. 당시만 해도 마드라사 네트워크가 오스만의 민간 사회를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었다.
누르시는 전국의 수행장을 주유하며 실력을 더 쌓아갔다. 신학 논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를 도처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억력도 비상했다. 코란 암송은 물론이요, 이슬람 문명사를 수놓은 주요 학자들의 저작까지 술술 외웠다. 그의 출중함에 감탄한 한 울라마로부터 '시대의 경이'라는 호를 얻게 된 것이 15살 때이다. 특출한 인물이었다.
결국 동아나톨리아의 주지사가 그를 부른다. 발탁하여 등용하려 한 것이다. 오스만제국은 울라마가 도통(道通)을 쥐는 학자-관료 체제였기 때문이다. 관저에서 살게 된 누르시는 오스만제국이 구축한 도서관의 혜택을 한껏 누릴 수 있었다.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표준어로서의 '오스만어'도 그곳에서 익혔다.
그 오스만어를 통하여 마드라사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유럽의 과학 지식들을 습득해간다. 그러고는 오스만제국이 채용해야 하는 독자적인 대학 교육 계획을 입안한다. 과학과 이슬람이 결합하는 대학 설립을 궁리한 것이다. 이름은 '광명(光明)학원(Medresetuz-zehra)'이라고 지었다. 궁정에 출입하는 울라마들에게 과학 교육을 접목하여 오스만 조정 자체를 대학처럼 만들고자 했다. 이스탄불에 입성하여 칼리프에게 직접 상소를 올린 것이 1907년, 30살 때이다. 오스만 말기를 대표하는 교육 개혁가였다.
당시 이스탄불에서는 '청년 투르크'가 활약하고 있었다. 누르시는 비판적이었다. 무슬림 통일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화산>이라는 잡지에 정력적으로 투고하며 '동서 문화 논쟁'을 펼쳐간다. 일체의 근대화에 저항했던 것이 아니다. 입헌정 수립에는 십분 동의했다. 다만 '세속화'만큼은 결연히 반대했다.
물질 개벽은 백번 수긍하지만, 정신 개벽을 방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유물론에 취하여 세속주의 일방으로 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기, 전쟁 포로가 되어 러시아에서 2년간 복역한 적이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현지에서 지켜보았다. 1918년 결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누르시는 무신론의 공산주의 국가를 끔찍하게 여겼다. 과학과 이성, 이념만으로 출현한 나라가 100년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그는 울라마 개혁 위원회에 참여하여 필사적으로 오스만을 구하고자 했다. 레닌과 소련에서 영감을 얻은 파샤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도리어 이성의 단련과 과학의 발전이 유럽만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스만 600년, 이슬람 1000년을 통해 상시적으로 일어나던 일이다.
이스탄불이야말로 이성과 과학이 꽃피는 문명의 중심지였다. 즉, 그가 고안했던 '광명학원' 또한 평지돌출이 아니라고 했다. 오스만적 근대화의 응축이었다. 이슬람 세계의 정수인 오스만제국을 각성시킴으로써 이슬람 문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럽의 법체계 도입에 반대하지 않되, 이슬람법의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 년간 수천 수만의 울라마들이 갈고 닦은 샤리아의 대해(大海)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법이라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었다. 방점은 완미하고 완숙한 이슬람법의 확립에 찍혀 있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공화국이 들어서고 '조국 근대화'가 펼쳐지면서 누르시의 '오스만몽'은 기각되고 만다. 도리어 반동파의 수괴가 될 수 있는 요주의 인물로 감시받았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시간이 많았고, 출소하더라도 유배와 연금 생활이 이어졌다. 일체의 공적 활동이 봉쇄된 것이다.
그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펜과 종이 뿐이었다. 저술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슬람을 근대적인 삶에 부합하도록 갱신함으로써 코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전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노라 선언하며 집필에 전념한다. 그 필생의 집념으로 완성한 역작이 6000쪽의 대작 <빛의 책(Risale-i Nur)>이다.
허나 새 책이 아니다. 코란을 주석한 책이다. 고전을 새롭게 읽어낸 책이다. 온고지신, 법고창신을 실천한 책이다. 다만 저술의 방향이 달라졌다. 더 이상 세속주의 엘리트들을 향해 발언하지 않았다. 토착 민중들을 향해 발화했다. 기층에 뿌리내림으로써 사상적 만개를 이룬 것이다.
세속 국가가 이슬람을 탄압해준 덕분에, 이슬람은 더더욱 하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슬람의 민중화, 이슬람의 민주화, 이슬람의 근대화를 촉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서구적 세속주의도 아니요, 이슬람 근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다. 개신(改新) 이슬람이자, 민중 신학이었다. 말씀을 통한 지하드를 실천하고, 선의와 선업을 베푸는 행동주의를 고취했다.
<빛의 책>은 알음알음 전파되었다. 서슬 퍼런 군사 독재 아래 출판과 복사는 불가능했다. 검열을 피하는 길은 필사뿐이었다. 6000쪽의 책을 필사하고 또 필사함으로써 마을에서 마을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갔다. 그 책을 함께 읽는 강독회와 학습회도 만들어졌다. 세속주의를 가르치는 근대적 학교도 아니고, 이슬람을 고수하는 마드라스도 아닌 민간 교육 기관이 자발적으로 솟아난 것이다.
누르시가 꿈꾸었던 '광명학원'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이슬람과 과학의 조화와 통섭을 모색했다. 이성과 영성의 공진화를 도모했다.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다. 이슬람을 몸에 익힌 과학자와 기술자, 정치가와 사업가를 양성코자 했다. 근대적인 이슬람 사회를 만들어가는 훈련장이자 실험장이 된 것이다. '경건한 시민'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복수 정당을 허가하는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자마자 '이슬람의 부활'이 일어났다. 이슬람 정당이 약진했다. 모스크 건설이 급증하고 이슬람 설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도 재차 문을 열었다. 아잔 역시도 아랍어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슬람의 가치를 강조하는 지식인들도 공론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갔다.
자유와 평등보다는 '공정'(公正)을 내세웠다. 공명정대야말로 이슬람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공정함을 무기로 삼아 일방적인 세속화,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려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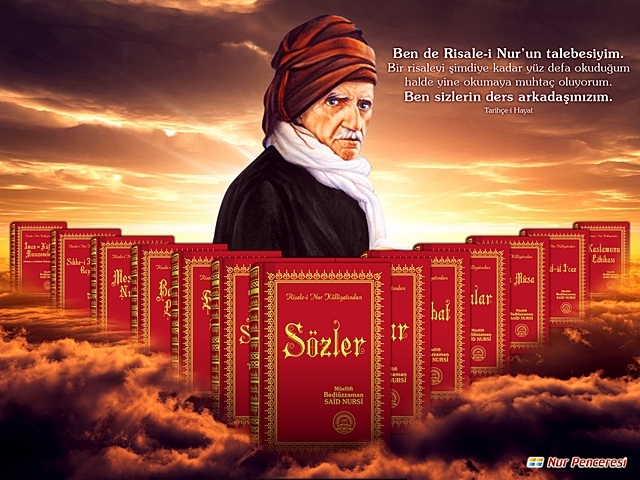
▲ 사이드 누르시 전집 광고. ⓒwikipedia.org
군부는 긴장했다. '조국 근대화' 30년에도 기층 사회는 압도적으로 이슬람의 영향이 지대했다.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서는 아타튀르크의 이상이 실현될 수가 없었다. 세속주의 공화국의 근간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군부였다. 재차 '진보'를 위해서 정치에 개입한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1960년이다.
공교롭게도 누르시가 숨을 거둔 해가 1960년이었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인들은 누르시를 부관 참시했다. 그의 묘소를 파헤쳐 시신을 옮겨버렸다. 성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세속화라는 금과옥조의 國是(국시)를 지켜내기 위하여 불경한 짓을 마다치 않은 것이다. 사법부와 합작하여 이슬람 정당을 해산시키고 주요 지도자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숙청했다. 이에 대학과 언론에 근무하는 '자유주의' 도시인들은 환영했다. 반동파의 소굴인 모스크에서도 사회학과 경제학을 가르치라는 행정 명령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터키 현대사의 방향은 갈수록 누르시의 쪽으로 흘러갔다.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재이슬람화가 역력해져갔다. 아니 이슬람파야말로 군사 독재에 맞서는 민주 세력의 선봉대가 되었다. 기어이 새 천년에는 이슬람주의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여당이 된다. 안정 과반석을 유지하며 15년째 집권하고 있다. <빛의 책>이 뒤늦게 광명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르시를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로 페툴라 굴렌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을 꼽을 수 있다. 굴렌은 민간 사회에서 이슬람 시민 운동을 만개시켰고, 에르도안은 '공정발전당'을 발족시켜 정치 권력을 움켜쥐었다. 새천년 터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반전의 물결, 재이슬람화와 신오스만주의의 풍경은 다음 주에 살펴본다.
'Tour > Tour - Worl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명의 바닷길 - 주강현 (시사인 연재) (0) | 2015.06.08 |
|---|---|
| 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 김덕영 (한겨레) (0) | 2013.01.10 |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0) | 2013.01.08 |
| 잉카유적지 쿠스코·마추픽추 (0) | 2012.12.14 |
| Coffee Road - 박종만 (0) | 2012.03.29 |